잠이 오지 않는다. 레포트를 한 개 써야하고 내일 수업때 읽어가야 할 텍스트는 읽지 않았다. 그런데 긴장감이 별로 없다. 이것이 내가 배운 코딩 수업의 최종 작업이 될 것이다. 지속 가능한 작업. 이전까지 사서 쓰던 종이 노트는 더 이상 구입하지 않고 있다. 아마 조만간 구입하지 않을까. 이곳은 완전한 사적 공간이라기에는 넓다. 그것을 유지시켜주는 것은 단지 어디에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누군가가 볼 수 없게끔 하는 제동장치는 아무것도 없다. 무언가를 지우고, 다시 쓰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원래 썼던 노트들을 선별하여 이곳에 옮겨적지는 않을 것이다. 단지 지치거나 힘들 때, 혹은 여유로울 때 했던 것들을 대신하는 무언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아마 학교에 다니면서 노트북은 항상 들고 다닐테니 말이다.
무언가를 쓴다는 것은 결국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함이다. 그것이 노트이건 어느 것이건 상관이 없다. 어떤 흔적들을 남기는 것은 나중에 나에게든, 혹은 다른 사람에게든 발견되기를 바라는 욕망으로부터 비롯된다. 말이 기억에 의해 쉽게 날아간다면 문자는 그렇지 않다.
미술을 하나의 정글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조셉 콘래드의 암흑의 핵심에서 등장하는 커츠 대령이 어떤 조직 내의 우두머리들이고 누군가는 한 명의 여행자가 될 것이다. 그 안에서 어느 경지에 올라간 사람들은 다름 아닌 광인들이거나 그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이 아닐까. 미술이 현실에서 점차 격리되어 그들만의 리그로 변질되어가는 과정이 과연 맞는 것일까 생각해본다. 만일 그것이 하나의 현상이라면 미술은 언제나 그들만의 리그였고 따라서 예술과 삶의 합일이라는 이데아는 하나의 환상이지 않을까? 예술이라는 이름이 생겨난 이후 그것의 분과가 발전되어 온 과정은 이격을 통해 그 자체를 존속시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을까? 예술과 삶이 필연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면 그것의 합일을 추구하는 것은 정글로 뛰어들어가 스스로 고립되기를 자초하는 것처럼 죽음으로의 충동과 연관되지 않을까? 자신이 고립되었음을 인식하게 해주는 것은 오로지 여행자, 즉 다른 집단의 존재였다.


나는 관심받기를 좋아하는 것 같지만 그 방법이 습관적이지는 않았나 생각한다.
무언가에 몰두하는 것은 이목을 끌기 마련이다.
오늘 비엔날레 아티스트 강연에서 '연대를 위한 장소' 라는 말이 나왔는데 연대를 위해 꼭 장소라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개인의 구성 자체가 상이한 차이들의 집합으로서 연대가 된다면, 집단으로서의 연대가 굳이 필요한 것인가 싶다. 공통의 가치 아레에서의 연대가 아닌 개인 간의 주고 받음으로서의 연대.

3월 30일은 친동생의 25번째 생일이었다. 나는 선물로 바지를 사주었다. 나는 새 작업을 「25」라는 제목으로 구상하고 있다.

내가 동생에게 선물을 줄 때 그는 나에게 빌렸던 바지를 돌려주었다.
개인이 단일한 동일성으로 묶이지 않는다면, 따라서 어떤 유사성들의 집합으로 인식된다면, 그로 말미암아 차이들의 집합으로서도 인식이 될 수 있다면 이들의 연대는 성립이 가능하다. 즉 연대는 하나의 공통분모가 아닌 유사성 찾기 놀이에 기반을 두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공동체의 '가치'라는 것도 유사성과 차이의 상관관계가 작동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나의 신체 또한 사실상 이런 유사성들의 연대이며 그것은 단지 나의 몸이라는 언어적 사실때문에 단일한 개체, 혹은 각 부분의 종합으로서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몸이 개체, 혹은 개인의 것이라는 인식은 어디까지나 언어로부터 비롯되었으며 과학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생리적 연관 관계들의 집합에 불과하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그러나 개념은 근본적으로 언어에 의한 필연으로서 형성될 수 밖에 없는데 우리의 신체는 이러한 필연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오히려 신체는 이 필연에 온전히 부합할 수 있다는 목적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광주로 가는 기차에서 동료 한 명에게 내가 동생에 대한 작업을 구상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더니 그 분이 전에 자신의 친누나에 대한 작업을 진행했었는데 자신의 형제자매를 작업이라는 이름으로 소재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고 이야기했다. 그 전에, 즉 3월 중순 즈음에는 또 다른 동료에게 가족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더니 나에게 그 가족들에 대한 자료들을 픽션화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주었다. 사실인데 이것이 정말 사실인지 궁금하도록 말이다.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 작업을 시작하면서 이러한 의문이 들기는 했다. 가족이라는 존재는 필연적이기 때문에 평범한데 도대체 왜 이것이 필연적이고 평범한 것이지? 사실 내 출생의 과정을 나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 나에게 있어 더 필연적인 것이 아닌가?
어제 새벽에 발제를 제출하고 수업 시간까지 30분 정도 짬이 났다. 항상 무언가를 해가면 긴장이 된다. 이전에는 손발이 저렸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만큼 전력으로 무언가를 하지 않았다는 반증인가? 오늘은 뭔지 모르겠는 그런 상태로 아침을 시작했다. 요즘의 미신은 아침, 혹은 잠들기 전 자정이 넘어가며 감각되는 하루의 첫인상이 그 하루의 전체를 지배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첫인상이 좋지 않으면 그 하루가 지나가기를 기다려야하고 반대로 느낌이 너무 좋으면 그 하루가 영원히 지속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만일 아무도 이것을 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좋지 않을까? 덕분에 글을 쓰기는 편하다.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을 통제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어제는 동료 한 명에게 내가 동생에 대해 바지로 접근하는 이미지를 보여줬더니 형제 관계라는 것을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일종의 은유적인 언어유희로서 접근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피드백을 해주었다. 현재의 나는 어떻게든 언어유희라는 형식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는데 그것의 순간성, 즉, '여기 있음'을 감각하게 해주는 능력에 대해서는 재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본다.
동생은 아직 나에게 글을 보내주지 않았다. 전에 미팅에서 그가 생각하는 가족 관계에 대한 글을 써달라고 했는데 아직 주지 않았다. 미팅은 3월 31일이었다. 글을 써달라고 다시 이야기를 해야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아마 학회를 하느라 바빠서 깜빡한 모양이다.



동생은 얼마 전부터 할머니집 3층의 비어있는 옥탑방에서 학회 사람들을 데려와 술을 먹었다. 요즘은 일이 바빠 그러지 않는것 같다. 술집들이 밤 10시 이후에는 모두 문을 닫아 그곳은 술자리를 이어가기 위한 최적의 장소이다. 나는 어제 대학원 동기들과 그곳에서 술을 마셨다.
내가 미술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으로 결국 사람들과 연결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내가 집에서 벗어나 이 세계에 속해있다는 감각을 일깨워준다. 20세기 이후의 미술 또한 어떻게 보여주느냐의 문제에서 어떻게 연결되느냐의 문제로 전환되는 과정이 아니었나?
대학원에 오고나서 여자친구와의 사이가 급격하게 안좋아지기 시작했다. 물론 대학원에 진학한 나의 잘못이 크겠지만 아무튼 이 현상을 아무것도 아닌것으로 치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아무래도 그 전까지의 인간관계는 여자친구에 한정되어 있었던 반면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 적응의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이를 그녀에게 요구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동생을 작업으로 하는 것보다는 여자친구와의 관계회복이 먼저이지 않을까.
동생은 여자친구와 6년 정도 교제했다. 여자친구는 초등학교 교사로 2년째 재직중이다. 동생과 같이 할머니댁에 살 때는 그녀를 자주봤었다. 동생에게 이것저것 자주 사주기도 하고 동생은 여자친구의 부모님댁에 가서 술도 자주 마시고 자고 오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허락없이 이곳에 쓰는 것이 맞는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에 대해서도 나와 비교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제 여자친구가 코로나 19 밀접접촉자 판정을 받아서 나 또한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어제 스터디가 늦게 끝난 탓에 여자친구가 힘들어했다. 일요일에 스터디 사람들과 전시를 보러가기로 했지만 일단은 여자친구와 시간을 보내는것이 더 우선인것 같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미술은 근본적으로 교환 경제가 아닌 선물 경제에 의해 돌아가지 않나?
동생은 여자친구가 없을 때 내가 미치지 않도록 붙들어준 거의 유일한 사람이다.
우리는 왜 항상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반복하면서 항상 새로운 것을 기대할까? 우리는 모두 인간이기 때문이다. 누군가로부터 예측하지 못한 무언가를 받기를 기대하는, 무언가를 받기를 원하는, 그 무언가를 받았다는 기억에 의지해 무언가를 주고 싶어하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학교라는 공간에 있으면서 피할 수 없는 사실은 2012년 학교에 입학한 이후 나와 같은 과에서 4명의 재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나 또한 그런 욕구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2021년 1월 19일에 나는 수원에 있는 부모님댁에서 저녁을 먹다가 화가나 동생을 때렸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서울의 할머니댁에서 평소 아끼던 목도리를 찾을 수가 없어서 혹시 수원 집에 있는지 아버지께 찾아봐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용인에서 아르바이트가 있어 수원에 가서 저녁을 먹던 도중 아버지께 그 목도리를 찾아보셨는지 여쭤봤고 어머니는 그것을 왜 수원에 와서 찾냐고 말씀하셨다. 내가 서울 집에서는 그 목도리를 찾을 수가 없으니 아마 부모님께서 작년에 내 옷을 정리하면서 수원으로 가져가신 것이 아니냐고 말씀드렸다. 어머니는 그런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평소 집에서 옷을 잘 정리하지 않으니 없어진 것이지 않겠냐고 말씀하셨다. 나는 내가 평소에 옷을 정리하지 않는다고 부모님께서 내 옷을 주기적으로 정리하는데 옷이 없어지는 것까지 전적으로 내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언성을 높였다. 그 당시 동생은 나와 서울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 날은 수원에 있었다. 아무튼 동생은 그 자리에서 어머니의 말씀에 덧붙여 나의 옷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는 습관에 대해 언성을 같이 높이며 자신도 참고 사느라 힘든데 만약 내가 그런 요구를 하고 싶다면 본인의 습관부터 고쳐야하지 않겠냐고 했다. 나는 저녁을 먹다말고 앉아있던 의자를 부쉈고 그 옆에 있던 의자도 부숴 떨어져 나온 다리로 동생의 머리를 가격하려다 말고 그의 몸을 붙잡고 넘어트리려 했다. 동생은 넘어지지 않았다. 아버지는 나를 동생으로부터 떨어트려 놓기 위해 내 몸을 붙잡고 계셨는데 나는 그 상태에서 동생의 엉덩이와 다리를 두어번 걷어차고 아버지의 머리를 붙잡아 강하게 밀어낸 뒤 나와 떨어져 있던 동생에게 달려가 어깨로 들이받고 다시 넘어트리려 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다시 나를 붙잡으셨고 동생도 나의 목을 잡고 옆에 있던 쇼파 위에 내 머리를 눌렀다. 나는 마지막으로 당신들만 참고 사는게 아니라 나도 참고 산다고 이야기를 했다. 동생은 경찰에 신고를 할지 말지 고민하다가 그러지 않고 바로 서울집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다음날 근처에 따로 월셋방을 얻었다. 목도리는 이튿날 어머니께서 수원에 있는 집에서 찾으셨다. 나는 동생을 3월 1일에 다시 만나 사과를 하고 화해를 했다.
아마 2014년 4월이었을 것이다. 그때도 수원집에서 가족들끼리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동생과 언쟁을 하던 중 식탁을 엎고 그 위에 올려져 있던 프라이팬으로 동생의 머리를 가격하려다 동생이 자신의 팔로 그것을 막았다. 아무튼 나는 그날 바로 집을 나와 서울에 있는 할머니댁에서 지냈는데 아마 그것이 내가 지금까지도 수원에서 오랫동안 머물지 않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몇 달이 지나서 사과를 했던것 같다. 동생과 나는 2014년 2월에 유럽으로 한 달정도 같이 여행을 다녀온 차였다.
초중고등학교 전반적으로 나는 주변 친구들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다녔다. 고등학교에 다닐 때는 소위 학폭이라 하는 행위에 가담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처벌이 강하지 않아 교내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끝나기는 했지만 학폭의 가해자라는 사실은 지금도 변하지 않는다.
내가 물리적인 폭력의 피해자였던 적은 사실 체벌이라는 이름을 제외하고는 초등학교 시절 같이 어울리던 친구들에게 맞았을 때 뿐이다. 그때는 그 친구들과 어울리려면 그 친구들에게 맞아야했다.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수영선수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도 많이 맞았다. 그러나 내가 있던 수영부는 폭력의 문제에 있어 다른 팀들에 비해 비교적 양호했다. 내가 목격한 것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다른 팀에서 훈련을 받던 어느 정신지체 장애인 선수가 수영장 구석에서 코치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구타당하던 장면이다.
수영선수를 그만두고 미국으로 1년 정도 교환학생을 다녀온 적이 있다. 그곳 분위기는 한국보다는 폭력에 대해 어느 정도 경계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했지만 단지 나는 그 학교의 전교생 2000명 중 3명의 아시아계 학생 중 한 명에 불과했기에 그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곳에서 나와 같이 수영을 하던 학생 한 명이 자살했고 내가 모르는 두 명의 학생 중 여학생은 오렌지 과수원의 버려진 차 안에서 강간당한 채 불태워져 발견되었으며 나머지 남학생 한 명은 그가 살던 동네에서 이웃과 다투던 중 총격에 의해 사망했다.

Myungmin is watching
언어는 곧 좋은 장난감이다.
사람은 누구나 특별해지기를 원한다. 그것을 원하던 원하지 않던 간에 자신이 특별해지는 것을 근본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것이다. 더군다나 예술은 그에 대한 욕망이 거의 모든 것이다. 그것은 생산자나 수용자에 관계없이 작동한다. 연대감은 특별함이라는 감각의 반의어가 아니다. 오히려 특별함이라는 단어에 앞서 독창성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연대라는 개념과 대립하도록 여겨진 것이 아닐까?
작업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떠오를 때, 특히 그것이 이전의 내 작업들을 다루던 심리들과 거리를 두면서 아직 구조화되지 않은 상태로 머무를 때 오는 공포가 있다. 나의 심리와 취향으로부터 먼 무언가가 다가오는 공포 말이다.
동생은 내가 부탁했던 글을 어제까지 보내주기로 했는데 아직 보내주지 않았다. 그가 보내주지 않는다면 나는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을 예정이다. 아마 학회때문에 바쁠 것이라 따로 글을 쓸 시간이 나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 보내주지 않을까.
나는 페미니스트가 아니라는 발언을 여자친구에게 한적이 있는데 그녀는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하느냐고 화를 냈다. 그러나 내가 페미니스트가 아니라는 사실은 어쩔 수가 없다. 나는 내 양심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할 뿐이다. 나에게 있어 유일하게 확고한 입장이 있다면 개인이 집단에 의해 따돌림당하는 현상을 혐오한다는 것인데 이에 입각하면 그들이 비판하는 방식도 남성 중심의 위계문화와 다를 바가 없지 않나 생각한다. 적어도 내가 미술 대학을 다니면서 경험했던, 그리고 각인된 그들에 대한 주관적인 인상은 그렇다.
과연 한국에 비판할만한 개인의 자율성이라는 것이 있었나 생각한다. 그것들은 언제나 집단의 자율성에 입각한 것들이 아니었을까. 우선 친교 목적의 카톡방들을 모두 나왔다.
"이곳에서 나는 사물만으로 이루어진 세계에 갇혔다. 그 세계는 나에게 무시무시할 정도로 분명하게 보였고, 아무 말없이 가까이 다가왔다. 교수형당하는 사람이 비로소 밧줄과 나무가 어떻게 생긴지를 알게 되는 것도 그와 같으리라. 현관의 커튼 뒤에 선 아이는 커튼처럼 나부끼는 하얀 물체, 즉 유령이 된다. 식탁 아래 웅크리면 아이는 나무로 된 사원의 신상이 된다. 조각이 새겨진 식탁의 다리들은 사원의 네 기둥이다. 문 뒤에 숨으면 아이 자신이 문이라는 무거운 가면을 쓴 마법의 사제가 되어 아무 생각 없이 들어오는 사람 모두에게 마법을 거는 것이다."
여자친구가 벤야민의 책을 읽다가 위 문구를 나에게 보내줬다.
오늘은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나와 동생과의 관계를 이질적인 것들이 접목되는 사건과 이 사건의 재구성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가족은 내 소통의 한계로서의 공동체이지 않을까. 관계의 한계?
왜 가족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어려운가? 이미 내가 가족으로 작업을 하고자 마음먹었을때부터 가족을 다르게 보고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미 내 가족들에 대해 분석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내가 가지던 기존의 가족들에 대한 정서는 한참 물러나게 되는데 이 분석적인 관심이 가족들에게는 어떤 정서적 관심으로 받아들여질까?
이 둘은 분명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데 정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닌, 타인에 대한 투사이지 않을까? 나는 나에게 분석적일 수 밖에 없고 타인에게 정서를 느낀다.
어제 동생은 오랜만에 봉천동에 있는 집에서 자고 갔다. 나는 원래 동생이 쓰던 방에서 잠을 자는데 동생은 내가 쓰던 방에서 잠을 잤다. 그 방은 원래 할머니께서 쓰시던 방이다.
그저께 나는 수원에 있었는데 동생이 왔다. 나와 동생과 부모님은 오랜만에 같이 모여 밥을 먹었다. 나는 밥을 먹은 후 밤에 다시 봉천동으로 올라왔다. 식사 자리에서 각자의 mbti성향을 이야기했다. 동생은 esfp, 나는 intp였다. 전에 싸운 후 처음으로 다같이 함께 하는 가족 식사였다.
동생의 학회 동료들이 지금 3층의 빈 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고 한다. 동생은 조금 늦게 도착할 것 같다는데 나 또한 그 술자리에 참여할까 싶다.
선물은 나와 동생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 그 관계를 설명하지는 못한다.
동생의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왔다. 죽을 것 같다. 아싸 너너 아싸 너. 재밌었다. 동생이 어떤 사람인지보다 간만에 술게임을 해서 술을 생각보다 많이 마셨다. 전에 내 동기들과 마셨던 상황과 차이가 있다면 더 활발하고 각자의 개인적인 이야기들 보다는 술게임에 의해 술자리가 지속되었다. 학부 1, 2학년 때의 모습 같았다. 동생은 그들 중에서 나름 형이 되어가는 것 같았다. 게임.
문제는 동생과의 거리가 딱히 가까워지지도, 멀어지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삶의 관계들을 굳이 동생으로 국한시킬 필요는 없다.
내가 그저 술을 마시고 싶어 마시는데 그것이 의도된 것이라면?
오늘은 잠을 많이 자서 그런지 생각보다 숙취가 심하지 않다. 어제의 기억들을 되짚어본다. 같이 어울리는 데에 거리낌이 없었고 다들 신나게 놀았다. 그 집단 내에서 현수의 초상이 약간 그려지는데 이전에 내가 대학교 3학년? 혹은 4학년, 그러니까 군대에 다녀왔을 때 술자리에서 하던 말들과 어떤 역할들이 생각난다.
며칠 전에 동생에게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처음 장면이나 사건이 무엇인지 물어봤다. 동생은 2000년 즈음에 아버지가 운전을 하시면서 담배를 끊겠다고 말씀하신게 기억난다고 했다. 나도 그 장면을 기억하고 있다. 실제로 아버지는 담배를 끊으셨다.
학교에서 나오는 길에 동생을 마주쳤다. 학회 사람들과 다시 학교로 오는 모양이었나본데 표정으로 보니 꽤 차이가 나는 선배와 동행하는 것 같아 보였다. 뭔가 긴장한 눈빛이었다. 둘 다 간만에 안경을 쓰지 않았다.
Somebody find me!

오늘 같이 학부를 다녔던 대학원 동료 둘과 실기실에서 이야기를 했다. 그 중 현재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내 동기 이야기가 나왔는데 학기 초 저녁을 같이 먹었던적 이후로 따로 연락한 적이 없었다. 아무튼 대학원 동료로부터 그 친구가 기존에 학교에서 받던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없어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아마 외부로 옮긴다면 비용이 꽤 들텐데 걱정이다. 오랜만에 전화를 하고 카톡을 보내봤지만 아직 답장이 없다. 원래는 그러려니 했는데 오늘따라 걱정이 된다. 방금 글을 쓰는 도중 다시 전화가 와서 잠깐 보러가기로 했다.
어제 친구와 나눈 대화 중 스프라이트에 대한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다. 스프라이트는 말하자면 스타크래프트1과 같은 옛날 게임 속 각각의 캐릭터들의 움직임을 구현하기 위한 청사진 같은 것인데 요즘의 3d 게임캐릭터들과는 아주 다른 접근법이라고 했다. 그리고 주로 관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친구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인터뷰를 아카이빙하고 싶다고 했다.
관계의 형성에 개인의 의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적다. 관계의 소멸 또한 마찬가지이다. 대상에 대한 의식 자체가, 즉 기억이 사라져야하기 때문이다.
아침에 일어나다 문득 이분화라는 것에 대해 생각했다. 시각에서 하나의 대상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을 둘로 쪼갤 수 밖에 없다. 이를테면 공기청정기라는 사물을 볼 우리는 '공기청정기'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서 그 사물을 자연으로부터던, 혹은 그 사물 자체로부터던 나의 언어를 이용하여 분화시킨다. 만약 두 개의 대상이 눈 앞에 주어져 있을 경우 우리는 그것을 하나로 통합하려 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두 대상은 우리의 시각과 정확하게 대응되는 방식으로 분화되어 있기에 어떤 인과 작용이나 기능같은 것을 도출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하나의 언어적 대상, 혹은 개념으로 통합할 수는 없다. 세 개 이상의 대상이 있을 경우 우리는 그들의 유사성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집합으로서의 언어를 분화시켜 도출할 수 있다. 이때 통합은 두 개의 대상일 경우보다 용이하다.



이제껏 내가 해왔던 잘못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희망은 없다. 자책에 의한 파괴가 아니라면 그에 따른 책임만이 존재할 뿐이다. 생각을 하다보면 항상 과거의 돌이킬 수 없는 어리석음으로 귀결되는데 이는 현재의 나 또한 어리석다는 것을 반증한다.
깍두기
왜 나는 맨날 똑같은 걸 하고 있을까?
인스타나 이것이나 중독되는건 매한가지이다.
원래 같았으면 이 웹페이지를 지웠을텐데 이걸 지우는 것만이 능사일까?
p
동생은 나와 싸운 후에 집을 근처의 원룸으로 옮겼는데 오늘 그곳에 다녀왔다. 현재 내가 있는 할머니댁에 비해 매우 좁았다.
독창성에 대한 욕망은 결국 소외로 귀결되지 않을까?
20일 새벽에 동생으로부터 가족 관계에 대한 글이 왔다. 생각해볼 내용이 많아서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하면 될것 같다. 오늘은 동생의 집에 다시 가 어제 저녁에 문득 생각났던 사진을 찍고 왔다. 동생 집에 너무 자주 가면 안될듯 하다.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일요일에 봉천동으로 오기로 했다.

자유를 내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찾을 수 있을까? 타인은 나에게 속박이 아닌 자유가 될 수 있을까?
비트코인의 성장은 양적 완화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비트코인의 붕괴는 곧 대공황이다.
시작은 좋았다. 목요일날 면담도 순조로웠고 결국 바지로 오브제가 선택됐는데 이 시점부터 쉽지가 않다. 오늘 동생은 집에 잠깐 다녀갔다. 사진을 다시 찍었는데 영 좋지가 않다. 역시 작업은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다.
내 옷을 둘러싼 동생과의 갈등은 많다. 바지와 관련된 것은 그리 많은지 모르겠지만 말이다. 이전에는 동생이 내 옷을 입는 것에 민감했었다. 옷에 뭐가 묻는 것이 싫었기 때문인데 학교를 졸업하고 돈을 벌어야되면서 옷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졌다. 그 전에는 관심도 많았거니와 내 지출에 있어서 옷의 비중이 꽤 있었다. 요즘은 거의 입던 옷들만 입고 다닌다. 외모를 가꾸거나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야겠다는 관심도 딱히 없어졌다. 그 때부터 동생은 내 옷을 거의 매일 입기 시작했다. 사실 의류에 대한 지출이 없던 것은 아닌데 내 옷을 사지 않기 시작한 이후로 주로 여자친구의 선물을 사는데 썼다. 동생은 같이 살 때 내가 옷을 벗어두고 제대로 정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다.

동생은 작년에 운전 면허를 땄다. 나는 아직 딸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말이다. 동생에게 운전을 해달라고 해볼까 싶다. 궁금하기도 하고 말이다.
동생은 면허를 따고 운전을 한적이 없어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면허를 따볼까 한다.

오늘 공간 형에서 이유경 작가의 개인전 〈Soft Orgasm〉을 보고 왔다. 왓츠앱, 혹은 온라인 배송과 같이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들의 촉각성을 보여주고자 한 것으로 보였다. 여자친구가 독일에 있을 때 나와 주고받던 소포들, 매일 영상통화를 끊기 전에 핸드폰 카메라 위에 하던 뽀뽀들이 생각났다. 좋은 전시였다.
동생은 새벽에 집으로 들어와서 다시 자고 나가는 모양이다. 어제 학회가 끝나고 바로 집으로 온것 같다. 동생이 내 옷을 입는 이유는 자기 옷이 없어서라기보다 내 옷이 좋아보여서 그런것 같다. 아침에 나오기 전에 현관에 모여있는 신발들을 찍었다. 방금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다.
만약 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이 아닌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전쟁이 될 것이며 이는 국가 내 내전의 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권위주의로의 퇴행을 받아들일 만큼 허무해지지 않았는가? 이 시대에 민주주의라는 것이 작동을 하는가? 단지 방임주의와 권위주의의 두 극으로 양분되어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그것의 기본부터 재고해봐야 하지 않을까?
내가 뭘 하고 있는 것인지 도저히 모르겠다. 그래서 기분이 좋기도 하고 말이다. 그러면 안되는데 말이다.
작업을 하다보면 각종 아이디어들의 유혹이 있다. 물론 그리 나쁜 아이디어들은 아닌데 그렇다고 썩 마음에 들지도 않는다. 이는 감각의 문제라기보다는 양심의 문제에 더 가깝다.
이 작업이 좋을지 나쁠지가 아닌, 해야될지 말아야될지에 관한 문제들.
방금 동생이 왔다. 바지를 가지고 어떻게 작업을 진행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이제 별 고민이 없다. 그가 서브웨이를 하나 가져와서 먹었다. 맛있게 먹으니 마음이 편해졌다.
4월 30일에 동생과 점심을 먹었다. 작업을 위해 몇 가지 할 일들을 부탁했다. 무슨 이야기들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주로 동생이 하는 학회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자신은 이 학교의 분위기와 대체로 맞지 않는것 같다고 했었다. 주말 동안 재충전을 했다. 다음 주도 쉽진 않겠지만 말이다.

학교라는 집단에 소속되다보면 인간관계라는 것을 신경 안쓸래야 안쓸 수가 없다. 더군다나 누군가 그 관계에서 배제당하는 모습을 목격하면 그걸 겪었던 입장에서 외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사실 이유를 불문하고 화가 난다. 나도 졸업을 하고 학교에 다시 들어오면서 변한건가 싶기도 하다. 이전에는 어떤 집단에서건 누군가 배척당하는 것이 당연한듯 싶었다. 단지 좀 짠한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그냥 넘어가지지가 않는다. 사람이 좀 모가 난건가 싶기도 하다.
나야 어차피 암묵적으로 배척당한다 한들 더이상 죽고싶다는 생각도 안들거니와 내 삶이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되지는 않는다. 그저 가치관이 다를 뿐이다. 나 스스로가 남을 따돌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수 밖에.
중학교 시절 내가 다니던 학교는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같이 다녔다. 한 반에 한 명 꼴로 장애 학생들이 있었는데 중학교 1학년, 그러니까 14살 무렵 그 친구들을 매일같이 괴롭혔던 기억이 있다. 그 현상은 어느 반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우리 반에 경우 똑바로 걷기가 힘든 여학생이 있었는데 하교길 복도에서 내가 그 학생의 등 뒤를 발로 차 넘어트렸던 기억이 난다. 내가 여기에 이 사실을 적는다고 잘못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단지 죄책감을 덜고 싶은 비열한 마음 뿐이다.
거울
어제는 동생이 봉천동 집에서 자고 갔는데 옷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동생은 내 옷들을 입는 이유 중 하나가 자신이 옷을 고르는 데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내가 평소 옷을 고르는 데에 꽤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인데 동생은 나와 신체 사이즈가 비슷하기 때문에 내 옷들을 입으면 적어도 옷을 못입는다는 말을 듣지는 않는다고 했다.
내일 모레는 첫 교수님과의 대면 면담이다. 긴장이 된다. 사실 그래서 지금 뭘 해야될지 잘 모르겠다. 빨리 자는 것이 방법일수도...

어제 봉천동에 올라와서 확인해보니 동생은 내가 입고 다니던 자켓을 가지고 갔다. 그 자켓은 원래 동생 것이었다. 내가 샀던 것에서 사이즈만 한 치수 작은 같은 옷인데 내가 사는 것을 보고 따라 산 뒤 동생은 그것을 내가 입는것에 꽤 민감해했었다. 원래 내가 샀던 옷은 사이즈가 너무 커서 잘 입지 않게 된다. 그래서 그의 옷을 더 입고 싶게 되지만 동생이 그것을 가지고 간다 한들 다시 돌려달라 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 따라서 나는 동생에게 옷을 골라주거나 옷을 제공하는 코디이지만 나는 그의 옷을 입을 수 없다. 나는 그가 내 옷을 입는 것에 대해 딱히 뭐라하지는 않지만 그는 내가 그의 옷을 입는 것을 꽤 민감해한다. 차라리 같은 옷을 한 벌 더 사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러기에는 돈이 너무 없다.
이전에 집에서 전시를 했을 때 동생은 자신의 친구들을 많이 데려왔다. 내가 받았던 느낌은 딱히 내 작업이 좋아서라기보다 내가 전시를 한다는 상황을 자신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로 활용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나도 서울대 경영대생이라는 동생의 타이틀을 내 아이덴티티에 첨가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 사실 이 작업도 그 영향이 클 것이다. 내가 동생과 연결되고자 하는 욕망은 실상 학연이라는 기제 때문이 아닐까.
동생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글도 더 이상 보내주지도 않고 말이다. 뭘 부탁해도 오는 것이 없다. 도와줄 생각이 있기는 한걸까.
비트코인은 현대 사회의 이데올로기, 혹은 그것의 붕괴이다.

"we are close to awakening when we dream we are dreaming"
어제는 동생의 여자친구의 생일이었다. 그래서 선물로 핸드크림을 보내주었다.
Br
Other
어떤 물적 존재는 가치가 아니면서도 사용가치일 수가 있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그 물적 존재의 효용이 노동에 의해 매개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다. 예를 들면 공기나 처녀지, 천연의 초원이나 야생의 수목 따위가 그러하다. 어떤 물적 존재는 상품이 아니면서도 유용한 것일 수 있으면 또한 인간노동의 산물일 수도 있다. 자신의 생산물로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사람은 사용가치를 만드는 것이지 상품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단지 사용가치를 생산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타인을 위한 사용가치, 즉 사회적 사용가치를 생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또한 단지 타인을 위해서 생산하는 것만으로도 안 된다. 중세의 농민은 영주에게 바치기 위해 세곡을 생산했고, 성직자를 위해 십일조 곡물을 생산했다. 그러나 세곡과 십일조 곡물은 모두 타인을 위해 생산된 것이면서도 상품이 되지는 못했다. 상품이 되려면 생산물은 교환을 통해 그것이 사용가치로서 쓰일 다른 사람의 손으로 옮아가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어떤 물적 존재도 사용대상이 되지 않고는 가치가 될 수 없다. 만일 어떤 물적 존재가 쓸모가 없다면 그것에 포함되어 있는 노동도 쓸모 없는 것이고 또한 노동으로 인정되지도 않으며, 따라서 가치를 이루지도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 칼 마르크스 〈자본1-1〉 p.95
자립적이고 서로 독립해 있는 사적 노동의 생산물만이 서로 상품으로서 만나게 되는 것이다. - p.97.
상품의 근원이 사적 노동의 생산물이라면 언어화된 지식 또한 사적 언어의 생산물이지 않을까? 즉 상품 이전의 사용가치만을 지닌다면 사적 노동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언어 또한 지식 이전의 사용가치를 지닌다면 사적 언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지 않을까? 근본적으로 교환적이지 않은 사용가치.
비교대상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내일은 이론수업의 발표날이고 31일까지 제출해야할 레포트가 하나 있다. 발표준비는 제대로 되지 않는다. 아직 읽어야할게 너무 많다. 이번 학기 나름 열심히 학교를 다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보다. 작업은 또다시 손도 못대고 있는 상황이다. 여자친구와 싸우고 난 후 연락을 하지 않은지 어언 3일째이다. 진퇴양난이다.
살고 싶다.
당대의 패러다임은 이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대립에 의해 형성되는듯 하다.
수유역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먹었다. 날씨가 좋다.
홍상수 감독의 영화 인트로덕션을 보고 - 시도는 좋았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50대 장년 세대의 자기 위로로 밖에 비쳐지지 않는다. 문제는 영화 전반에 깔려있는 그 '연민'이라는 정서인데 연민 이후의 그래서 뭐? 와 같은 질문이 생각난다. 연민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단지 본인의 무능력에 대한 비애이며 유미주의적 전환이다. 결국에는 사랑이다. 사랑은 많은 것들을 해결해준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문제이다. 세대 차이, 젠더 차이, 계급 차이, 빈부 차이, 문화 차이 등등...이런 것들이 공고해지는 방식이기도 하다. 심지어 사랑은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들을 간과하도록 마비시킨다. 특히나 한국 사회 내에서 수많은 차이들이 가시화된 이 시대에 사랑은 그 갈등들을 봉합시킨다는 명목으로 다시 그 차이들을 동일성의 테제 속으로 흡수한다.
꿈과 언어는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주체가 언어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은 타당하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 주체에 해당되는 것이기에 주체는 나를 표현하는 여러 항목들 중 하나의 항에 불과하다.
만일 미술의 수용방식에 있어 관람자도 주체가 될 수 있다면 로버트 모리스 이후의 수용자 중심 미술은 이 수용자들을 남성 주체로 상정해오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로버트 메이플소프의 남성 누드들이 동성애의 맥락에서 읽히는 것은 단순히 작가가 남성이기 때문에 남성을 그것의 수용자로 암묵적으로 상정하면서 생기는 현상일 수도 있지 않나?
내 작업들이 아닌 것 같은 내 작업들을 눈 앞에 마주했을 때 그것들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이전 같으면 그것들을 가차없이 외면했겠지만 지금은 고민이 된다.
내 삶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잠깐의 생각들, 잠깐의 자유 등등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누군가나 무언가를 생각하면서 혹은 그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에서 감각되는 특질들일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특질들은 적어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정도는 다시 볼 수 있게끔 해주며 내뱉었던 말들에 대한 불안감이 아닌 반추와 반성으로, 그리고 그 반성에 대한 확신으로 기능한다. 이때 확신은 반성의 단순한 결과값이 아닌 그 과정 자체의 벡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가치의 붕괴는 과연 오늘날만의 일일 것인가? 노동가치라는 것은 단순한 허상이 아닐까?
루이즈 로울러를 위하여


미술 존나 재미없고 피곤하기만 하다.
언젠가부터 요란하기만 한 사람이 되는듯 하다.
그러지 말아야할 이유는 무엇이란 말인가?
아침에 학교에 오다가 에어팟의 충전케이스를 잃어버렸다. 오늘은 느낌이 좋았는데 잃어버린 케이스 때문에 쿠팡에서 하나를 주문했고 가격을 보고 통장잔고를 확인했다. 통장에는 50만원 정도가 남아있었다. 학기가 시작할 때는 그래도 300만원 정도 있었는데 말이다. 굳이 확인하고싶지 않았지만 확인을 하고나니 뭔가 맥이 빠진다. 당장 한 달 정도 버틸 수 있는 돈이다. 물론 최근 며칠 일을해서 충당할 수 있는 돈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 일 또한 쉽지가 않은 것이 뭔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에 언제 일을 나갈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다. 이제 주말에 편의점 일이라도 해야될성 싶다.
어제 여자친구로부터 조소과 대학원 남학생 한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학부 시절 이 학생과 석판화 수업을 같이 들었던 적이 있다.

청주에서 일이 끝나고 잠깐 카페에 앉아 서울로 올라가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미술관을 여기저기 다니는 일들을 하다보면 미술이라는 제도를 작동시키는 많은 부분은 공무원들이나 각종 사무직 종사자들에 의해서라는 생각이 든다. 미술제도를 하나의 피라미드로 상정하면 미술관에 들어가는 작품의 생산자인 작가나 담론의 생산자인 비평가들은 가장 아랫부분과 꼭대기 양쪽에 나누어져 분배되어 있으며, 미술관에 근무하는 행정직 종사자들이나 각종 관련 산업 종사자들은 그 중간 부분에 위치해있다.
실재는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은 지시대상을 가지지 않고 추상명사로서 존재할 뿐이다.
2012년 나는 대학교에 입학했다. 그리고 2021년 나는 대학원에 입학하여 현재까지 다니고 있다. 그 기간 동안 미술대학에서 5명의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다들 내가 한 번 이상은 이야기를 나누거나 그것보다 가까웠던 적도 있고 적어도 얼굴 정도는 아는 사람들이었다. 아마 내가 모르는 다른 이들이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아는 것은 이들뿐이다. 그들은 모두 남학생들이었다. 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들은 자세히 알지 못한다. 그저 건너듣거나 그 정보들을 가지고 짐작할 뿐 그들이 죽은 이유가 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한다. 단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만이 확실했다. 그들은 모두 얼마 간의 간격을 두고 죽었다. 1년 내지 2년마다 한 명씩 목숨을 끊었는데 그럴때마다 학교 구성원들의 반응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 말이다. 시간이 지나면 학교는 별일없이 잘 돌아갔고 나도, 친구들도 모두 학교 생활을 하느라, 혹은 생계를 유지하느라 바빴다. 그러나 3번째 사망자가 나온 후부터는 이것들을 떼어놓고 학교 생활을 하기가 힘들었다. 나 또한 개인적인 사건들이 누적되면서 지속적으로 충동을 느끼고 스스로 이상한 사람이 되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물론 내가 그들의 죽음을 여기서 말하기에 충분한 당위성을 가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누군들 이 당위성을 가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문제는 학교 구성원들 사이에서 그들의 죽음에 대해 쉬쉬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사실이었다. 그들이 어떻게 그들 스스로를 죽음으로 몰고 갔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도 없었고 학교의 자체적인 진상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보기가 힘들었다. 내가 용기가 없었던 것인지 혹은 학내 분위기 때문에 그랬던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말이다. 내가 이걸 여기서 말한다면 졸업을 못할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감도 생긴다. 스스로 뭔가 정의로운 일을 한다는 자아도취에 빠져 있다는 인상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재학생들 중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사실은 간과할 수 없다. 나는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내용을 여기에 보여준다. 물론 그들의 선택을 내가 막을 수 있다는 보장은 할 수 없지만 적어도 무언가라도 해보는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채 씁쓸한 감정만을 가지고 졸업하는 것보다는, 또 졸업 이전에 나 또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다는 충동에 견디지 못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선택일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또한 이들이 모두 남학생들이라는 이유로 남성이라는 정체성에 대해 대변하고 싶은 생각도 없거니와 요즘의 젊은 세대 남성들 사이에서 간간히 들리는 헤테로 남성이라 힘들다는 말에도 동의하지 않는 바이다. 아직도 많은 남성들은 그들이 주도적으로 일궈놓은 사회문화적 구조를 바탕으로 다양한 물리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단순히 성 정체성을 바탕으로 소수자의 패러다임을 규정하는 판단에 대해서는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단순하게 누군가의 고통이 그를 스스로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게 했다면 그 고통의 연원이 무엇인지, 혹은 나는 누군가의 이러한 고통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이 고통들을 소수자라는 일반화된 관념으로 환원시키는 것은 다른 누군가의 고통들을 배제시키는 역할을 할 뿐이다.
나는 요즘 심리적으로 그리 좋지 않은 시기를 보냈던듯 하다. 여자친구와 최근에 일어났던 자살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도중 많은 부분 충돌하는 지점들이 있었기도 하고 이 때문에 나도 죽고싶다고 그녀에게 말해버리면서 관계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갔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들을 가족들에게 했는데 그들도 이 말을 들은 이후 나에 대해 걱정을 많이하는 것 같다. 누군가의 죽음은 확실히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가져온다. 더군다나 그것이 갑작스레 벌어진 경우 그들의 부재에 대한 심리적인 충격은 쉽게 와해되지 않는다. 타인의 죽음에 대한 관심은 내 개인의 성취에 있어서 그리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한다.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천착은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도 한다. 이전에 나는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다. 내가 자살을 하더라도 학교는 졸업하고 나서 아무도 모르게 해야된다고, 설령 이것이 밝혀진다 한들 이에 대한 정보를 학교가 모르도록 해야한다고 말이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이 생각들은 언제나 학교를 다닐때 주로 했던 것들이다. 단순히 체력이 떨어진 것인지 작업을 더 하지 않고 있어서 그런 것인지 잘 모르겠다. 이제 죽음에 대한 생각들은 그만하고 작업을 열심히 해야할 때가 아닌가 싶다. 우선 동생에게 빌렸던 옷을 다시 돌려주고자 한다.
동생은 다다음주 정도에 다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으로 들어온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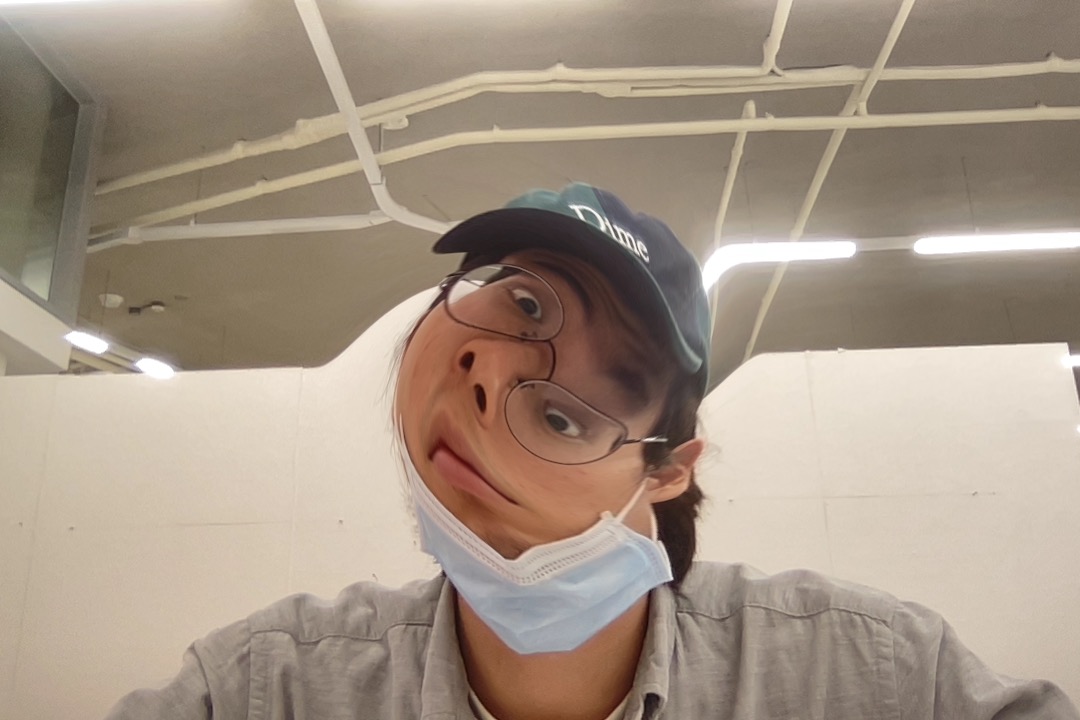

어제는 내 생일이었다. 이번 생일에는 뜻밖에도 상당한 축하 연락들을 받았다. 고마울 따름이다. 여자친구 덕분이라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는 모니터들, 핸드폰 화면들 사진들 등등은 모두 잠망경과 같은 시야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어쩌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외부의 시각으로부터 스스로를 차단하면서 우리의 시야를 포기하는 것은 아닌가?

어떤 물질에 대해 노동을 투여한 자는 그에 대한 거리를 두기보다 그것을 하나의 도구로, 혹은 해치워낸 일로, 그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보기보다 해야할 일로 인식하기 마련이다. 노동을 예술로 끌어들여 오는 과정은 그것에 대한 거리두기, 즉 그것이 단순히 노동이 아닌 미적인 무언가로 받아들여지기를 요구한다. 결국 미를 추구하는 행위는 사회적 계층의 구분, 혹은 스스로를 주어진 관계들 사이에서 상층부로 위치시키려는 욕망에 다름이 아니다. 따라서 하나의 그림을 본다는 것은 결국 그것에 집약된 노동으로부터 주체적으로 거리를 두는 행위에 다름이 아니다.
최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일이 많았다. 그곳에서 전시를 운영하는 모습을 얼핏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상당히 많은, 복잡한 체계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곳에서 어디까지나 하청업체의 아르바이트 노동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그곳에서 작가라는 이름을 가진 전시의 주체가 아닌 전시를 위한 작품을 설치하는 노동자라는 사실로 인해 작품을 만질 수 있는 물리적 거리와 작품을 둘러싼 제도로부터 기인한 사회적 거리 사이의 괴리를 체감할 수 있었다. 나는 단순히 작품을 전시장 내에 설치하기 위해 그 액자들을 잡는 역할을 부여받았다. 그것들은 나에게 작품이라기보다 각각의 택배물들에 더 가까웠다. 그것들은 미적 대상이기보다 귀중한 화물들이었다. 나는 그것들을 미적 준거에 의해 판단하기에 앞서 지시받은 정확한 치수들, 위치들에 맞추어 놓을 뿐이었다. 따라서 나의 시각은 그림의 내부가 아닌 그것의 틀이 수평, 수직을 이루어내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다른 그림들과 정확한 거리를 가지는지에 집중할 수 밖에 없었다. 나는 제도의 내, 외부도 아닌 그 틀 언저리에서 정확한 치수와 수평을 맞추기 위해 분투할 뿐이었다.
이건희 컬렉션이 오늘부로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어제 아침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과천관으로 작품을 픽업하는 와중에 리움에서 기증하지 않은 작품들이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 그 작품들은 프란시스 베이컨, 게르하르트 리히터, 사이 톰블리, 루이스 부르주아 등 국제적으로 천문학적인 가격이 매겨지는 작품들일 것이다. 그것들이 기증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확실하게 알 길이 없다. 단지 기증이 되지 않았다는 심증이 있을 뿐이다. 리움의 상설 전시관에 포진되어있던 외국 작품들이 어느 정도가 기증되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하지 않을까? 만일 미술품이 경제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의 가치가 일반 상품과 같이 일정하지 않고 경매에 의해 널뛰기를 한다면, 그리고 삼성이 그러한 경제적 가치를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이용한다면 기증하지 않은 작품들이 어떤 것들인지는 밝혀야 할 것이다. 10년 뒤 그것들의 가격 상승은 이번에 기증되어 공개된 작품들의 총액을 메꾸고도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증된 작품들의 양이 2만여점이라는 수치에 현혹되어서는 안된다. 그 수치는 기증되지 않은 작품들의 가격에 비하면 우스운 숫자들일 뿐이기 때문이다.

동생을 며칠 전 봉천동의 집으로 다시 들어왔다. 나는 현재 그가 나가기 이전의 방을 쓰고 있고 그는 내가 쓰던 방을 쓰고 있다.
사각 프레임은 필연적으로 대상화를 위한 조건이 될 수 밖에 없지 않은가?
전시실이라는 육면체의 공간은 작업물들을 하나의 맥락으로 묶어 보여주기 마련이다. 결국 작업들은 각각의 개체가 아닌 입방체의 공간으로 형상화된 작가-주체의 부분들이 된다. 그러나 작업이라 함은 그러한 3차원의 기하학적 형상화가 아닌 각각의 상이한 노동들의 형태로 생산된다. 따라서 작업의 지각 자체도 그러한 노동의 개입을 수반해야하지 않을까?
작품 운송 아르바이트를 하며 이런 저런 일들을 하다 잠깐 짬이 나면 그 회사의 직원들과 잡담을 하기도 한다. 그 직원들은 나이가 40대이고 요즘은 새로 들어온 사람이 함께 일을 하는데 그는 나보다 두살이 더 많다. 그들은 모두 남자이다. 40대인 직원들은 오늘 점심을 먹고 편의점 뒤에서 담배를 피면서 군대 이야기를 했다. 사실 내가 하는 일도 군대와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일이다. 단지 그 지시의 주체가 미술관일 뿐이다. 그들이 군대에 있을 때는 구타가 빈번하게, 사실 거의 밥먹듯이 발생하였는데 사실 내 학창시절만 생각해보더라도 나 또한 대부분 그러한 구타의 가해자였다. 워낙 어릴 때부터 장난이라는 방식을 시작으로 그러한 구타과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규정하지는 못하겠다. 단지 어릴때부터 다른 친구들보다 키가 컸고 가만히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아마 이러한 측면이 내가 구타의 가해자였다는 사실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부모님도 나에게 상당한 체벌을 했는데 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무렵 키도 부모님보다 커지고 중학교에 진학하면서는 수영선수도 했었기에 부모님은 그때부터 나에게 물리적인 체벌은 더이상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학교 내에서는 제도라는 미명하에 교사로부터 학생으로 체벌이 빈번했으며 학생들 사이의 물리적인
미술은 열심히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나는 지금껏 살면서 많은 과오들을 저질러왔다. 경우에 따라 내 잘못만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적은 있지만 시간이 지나도 내가 잘못한 것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여기에 나는 반성문을 적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적는다고 내 잘못들이 해결되지도, 숨겨지지도 않을 뿐더러 누군가에게는 용서가 되지도 않는 문제들이다. 나에게는 그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일종의 책임이다. 누군가의 잘못보다는 내가 행했던 잘못들에 대한 기억들 말이다. 그것들은 시대적 변화, 현재의 상황에 따라 다른 틀을 가질 수 없는 것들이다. 외려 그것들은 틀이 없기에 내가 그것을 잘못이라 규정짓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희석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나에게 그러한 잘못들은 점점 더 무거워진다. 그 잘못들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려 할수록 반대로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를 무너뜨리고 결국에는 죽음으로 이끌 것이라는 불안감에 사로잡히고는 한다. 내게 작업을 하는 것은 단순히 나의 업이 아닌 그러한 생각들에 진입하는 관문이다. 내가 어떤 작업을 하던지 그 불안감은 하나의 벽처럼 느껴진다. 누군가가 내가 했던 잘못들을 행하고 있으면 나는 그들에 대해 뭐라 말할 수가 없다. 또한 누군가가 나에 대한 잘못들을 말해도 나는 그에 대한 할 말이 없다. 물론 잘못이라 할 수는 있지만 어느 편에 서서 그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잘못했다고, 또 그들을 비난함으로서 나의 정당성을 찾는 것은 스스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나는 항상 스스로를 가해자로서 인식해왔다. 따라서 나를 피해자로 상정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지언정 내 잘못에 대한 뉘우침이 아닌 기만이라 생각해왔다. 작업을 하는 행위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주지 않는다. 단지 이 문제들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고자 하는 욕망을 촉발할 뿐이다. 나는 이러한 내 태도가 도덕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하지도 않는다. 나는 이미 도덕적으로 올바를 수 없는 잘못들을 행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잘못들을 기억하며 죽을 때까지 이 일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 뿐이다.
불안감이 아니라 평정심
평정심은 곧 수직과 수평에 대한 강박이다.
이에 대한 강요는 폭력의 또다른 이름일 뿐이다.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은 사각형으로 틀지어져 있다. 적어도 모든 공간들이 말이다. 그러나 눈을 감고 상상해 보자. 사각형은 우리의 시각을 규정짓는 조건으로서의 틀이 아닌 우리가 그려야만 하는 어떤 도형이다.
오랜만에 이곳에 글을 쓴다. 여자친구와 8월 초에 싸우고 난 후 이 웹사이트의 도메인 주소를 바꿨는데 이 때문에 내가 이 주소를 공개하지 않는 한 이제 사람들은 영영 이 사이트를 보지 못할 것이다. 동생에 대한 작업을 계속 하는 중이다. 동생은 아침에 옷들을 세탁하여 널어놓지 않은 채로 나가서 내가 빨리 그 옷들을 널어야 한다. 이번 학기는 초반부터 작품들을 발표할 일이 많다. 나는 하나도 이전 작업들을 정리해두지 않았다. 그래서 상당히 말을 못한다. 부끄럽기도 하고 아직 작업다운 작업이 한 개도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에 불안해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작업다운 작업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의 빈도가 조금은 줄어들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여자친구는 내년에 독일로 유학을 가고싶다고 했다. 나는 그 다음 해에 네덜란드로 유학을 가서 그녀에게 유로스타를 타고 별을 선물해주는 것을 상상하고 있다.
돌직구
작가의 위치는 언제나 1인칭 혹은 3인칭이었다. 그들의 위치가 2인칭인 적은 없었다.
시간이 지나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나도 사람들에게 결국에는 예전과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한다. 그런 생각이 들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은 무엇인지 허무해진다. 내가 노력한다 한들 바뀌는게 없을거라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이전과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어떤 운명같은 것이 이미 정해져 있어 이 세상에 새로울 것은 아무것도 없으리라는 허탈함만이 남는다.
지구종말은 인터넷의 밈일 뿐이다.

지구는 종말하지 않는다. 종말은 단지 인간에게 부여된 유한성일 뿐이다.
https://vimeo.com/721876505
오랜만에 이 홈페이지에 글을 쓴다. 여자친구는 지금 영국에서 유학 중이다. 동생은 얼마전 첫 인턴을 끝내고 입사원서를 넣느라 분주하다고 말은 하겠지만 사실 집에서 게임을 하기 바쁘다. 그리고 여전히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느라 바쁘다. 그동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어제는 영국의 왕이 교체되었다. 나는 우선 5년간 사용하던 외장하드가 망가졌다. 백업은 따로 못해둔 상태였다. 얼마전 최종적으로 복구를 맡겼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했다. 중요한 작업이 하나 들어있었는데 말이다. 아직은 대학원에 재학 중이다. 여름 방학에 인스타를 했었는데 그걸 하고 있는 스스로에게 환멸감을 느껴 지웠지만 마치 담배를 피고싶듯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데 마침 이 홈페이지가 문득 떠올랐다. 나는 스스로가 그동안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작년에 썼던 글들을 보니 생각보다 많이 달라지지는 않았다. 다만 다른 책에 저장되어 있는 2020년의 글들과 비교했을 때는 많이 달라져 있다. 나는 대학원에 들어오면서 어떤 종류의 단절이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단절을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 준비만 하다가 학교를 나가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된다. 혹은 학교를 나가야지만이 단절의 계기가 될 수 있을까?
장남인 나를 어떻게 설명할까? 장남으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이러한 기하학적 접근들에 대해서는 일단 제쳐둬보자. 나에게는 지금 우선 에어포켓이 필요하다. 숨을 쉴 수 있는 공간. 혹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온갖 대상화된 상념들과 자격지심, 파괴 충동들을 가둬둘 수 있는 일종의 베란다. 베란다. 베란다.
권위, 근 세달 동안 나를 괴롭혀오던 그 말, 다만 외면할 수도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그것에 대해 해석이나 예시도 첨가할 수 없는 그 단어, 나는 권위에 대한 욕망에서 자유로운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지금 나에게 어떤 형상으로 발현되는가? 권위의 심상, 권위는 항상 다른 누군가가 점하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점하기 위해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심상, 그것으로 인해 수치심을 얻을 것 같다는 심상, 혹은 수치심으로 인해 각인된 심상, 일종의 박탈감, 그리고 그것에 대해 함부로 말할 수도 없다는 느낌. 권위는 나에게 항상 어떤 불편함에 대한 감각으로, 타자로서 느껴진다. 그것은 과연 내 안에 있는 것일까? 나에게 선천적으로 내재된, 혹은 후천적으로 형성된 권위가 박탈당함으로서 감각되는 것일까? 아니면 그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단지 이 글을 쓸 수 밖에 없도록 타자의 형상으로서 찍어누르는 것일까? 혹은 다만 현재 내가 느끼는 압박감이 가중되어 권위라는 형태로 재탄생하는 것인가? 이 불편함.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나 어떻게든 그 손아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불편함. Way out의 문제들. 혹은 나 스스로를 지키고자 하는 방어기제로서 권위는 작동하는 것인가? 혹은 누군가가 공격이라도 해주기를 바라는, 기다리는 모습으로 작동하는 것인가? 그것은 억울함의 문제는 아니다. 유사한 감각일지라도 그것이 폭력으로서 인식되었던 이전과는 다른 양상이다. 그러나 반응은? 비슷하다. 버티기. 어떻게든 버티기. 이 시간이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라는, 혹은 지나가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버텨야 한다는 심상. 말을 하면 안된다. 적어도 내가 무언가를 하면 안된다라는 심상. 이 상황에서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게 낫겠다는 생각이 종종 든다. 그것은 스스로에 대한 일종의 결벽증 같기도 하다. 다만 버티는 것 외에는 아무런 생각이 나지를 않는다. 버티는 스스로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과연 무너질 수는 있는 것인가?
책 한권에 대한 발제를 해야 하는데 발제 준비를 하기가 너무 싫다. 우선 이 책이 너무 싫다.
유보적 상태의 공간
I'd never been thankful about being neglected, but it happend today. I don't know why it is so sweet. Maybe it proves me that i am not dumb anymore. You fucking dumbasses.
This line makes you attached whatever you looking for.
I am not allowed to wear purple t-shirt because I have a fucking history.
나는 왜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지? 나는 잘못한게 없는데? 왜 다들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지금껏 받았던 상처들을, 참아야 했던 것들을 제대로 다시 받아들이고 판단하는 것이다.
This line makes me attached to whatever I looking for.
피곤한데 지금 집을 갈까 아니면 학교에서 좀 더 하다가 갈까 고민이 된다.
잠을 잘잤고 음 그렇다.
이데올로기는 대량학살을 위한 무기이다.
오늘은 컨디션이 좋지 않다. 그저께 잠을 제대로 못잤더니 계속 컨디션이 좋지 않다. 오늘은 약간 몸살기도 있는 것 같고 말이다. 발제를 하나 해야되는데 엄두가 나지를 않는다.
발제를 시작했다. 집중이 잘 되지 않는다.
Me, such an alienated form.
대학원을 다니면 다닐수록 나는 못난 사람이라는 것이 새삼 느껴진다. 혹은 못난 사람이라 느껴야만 하던지, 아니면 나는 모범생이 아닌 것인지, 진중하지 못한 사람이라, 착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것인지. 머리가 나쁜 것인지. 나는 그렇다면 미술을 할 자격이 없는 것인지. 어쩌면 애초에 살 자격이 없는 것인지도...
수치심, 부끄러움, 아무것도 아닌것 같은 느낌
진지한건 뭘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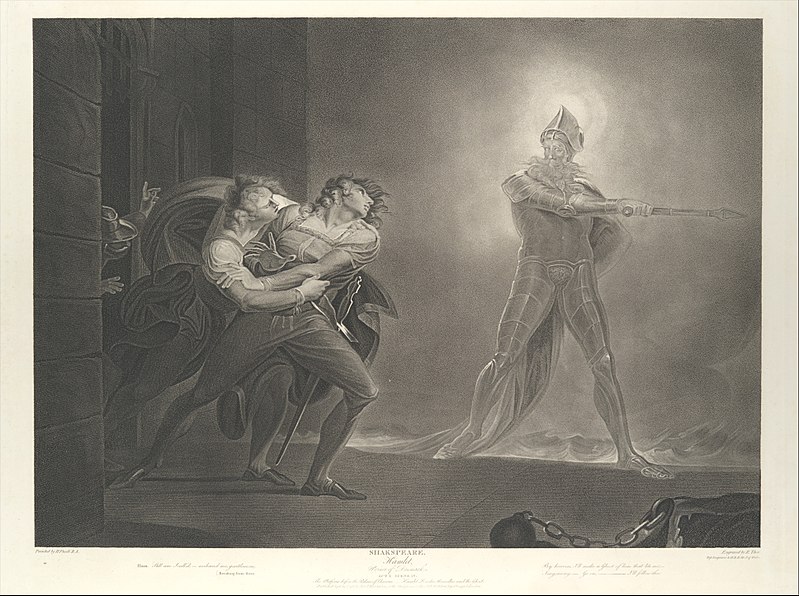
어제부터 지독한 감기에 걸렸었는데 다행히 잠을 많이 자니 괜찮아졌다. 간만에 몸이 아팠다.
카프카에 대한 수많은 해석 가운데 가장 나쁜 세 가지 주제가 있다면, 법의 초월성, 죄의식의 내면성, 언표행위의 주체성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카프카의 알레고리, 은유, 상징주의에 관해 써댔던 모든 바보짓들과 결부되어 있다. 또 비극의 관념, 내면적 드라마, 내밀한 법정에 대한 글들 역시 마찬가지다. 물론 카프카는 장대를 가지고 있었고, 그 장대를 오이디푸스를 향해 내밀기도 했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호의적인 것은 아니었으며, 오히려 자신의 '악마적' 기획을 위해 이용하려는 아주 특별한 용법으로 쓰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한 작가에게서 어떤 주제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그것이 그의 작품 안에서 어떤 정확한 중요성을 지니는지, 다시 말해 그것이 어떻게 기능하는지(그것의 의미가 아니라)를 정확히 묻지 않는다면 전혀 쓸데없는 일이 된다. 법과 죄의식, 내면성, 이는 카프카가 자기 작품의 표면적 운동을 진행시키기 위해 실제로 가장 필요로 했던 것들이다. 표면적인 운동은 다른 무엇을 그뒤에 감추고 있는 마스크를 뜻하는 게 결코 아니다. 표면적인 운동이란 분자적인 운동과 기계적 배치 -'표면적인' 결과는 전적으로 이것의 결과인데- 를 보여 주기 위해 실험을 이끌어 가야 하는 분해의 지점, 해체의 지점을 표시한다. 법과 죄의식, 내면성이 전부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주제가 어디에도 없으며 전혀 기능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글쓰기 기계의 세 가지 중요한 톱니바퀴인 편지-단편 소설-장편 소설 가운데 어느 하나의 부품만을 세심하게 고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각각의 톱니바퀴는 중요하고 정서적인 훌륭한 주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편지에서 그것은 죄의식이 아니라 공포다. 자신을 둘러싼 함정에 대한 공포, 흐름의 반송에 대한 공포, 햇빛, 종교, 마늘, 경건함으로 가득 찬 대낮의 기세에 놀란 흡혈귀의 공포다. (카프카는 편지에서 사람들에 대한, 일어날 일에 대한 아주 깊은 공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죄의식이나 굴욕감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동물-되기를 다루는 단편 소설에서 그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정서적 주조인 탈주다. 그것은 죄의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공포와도 구별되는 것이다. (동물-되기는 공포보다는 탈주로 진행된다.<굴>의 동물은 말 그대로 공포를 가지지 않는다. 자칼들 역시 공포를 갖지 않으며, 차라리 '어리석은 희망' 속에서 산다. 음악가 개들은 "공포를 가질 수 없으며 오히려 과감한 시도를 향해 자신을 던진다.") 마지막으로 장편 소설에서는 어떤 점에서 보면 기이할 정도로 K는 죄의식을 느끼지 않으며, 그렇다고 공포를 느끼지도 탈주하지도 않는다. 그는 전적인 과감성마저 지니고 있어서 아주 기묘한 새로운 주조를, 법적인 동시에 기사적인 분해의 방향을 보여준다. 이는 진정한 감정, 기분이다. 공포와 탈주, 분해, 우리는 악마적 계약, 동물-되기, 기계적 및 집합적 배치와 상응하는 이 세 가지 정념, 세 가지 강렬도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질 들뢰즈/ 펠릭스 가타리, 카프카, p.108~110
나는 왜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데로 샐까.
따라서 욕망은 공존하는 두 가지 상태에 처하게 된다. 한편으로 그것은 이런 성분, 저런 사무실, 이런 기계 내지 저런 기계 상태 속에서 포착되고, 이런 내용의 형식에 사로잡히며 저런 표현 형식으로 결정화된다. (자본주의적 욕망, 파시즘적 욕망, 관료제적 욕망 등.)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욕망은 모든 선을 다라 나아가고, 해방된 표현을 인도하고 탈형식화된 내용을 유도하며, 사법 내지 내재성의 장의 무제한성에 도달한다. 기계란 단지 역사적으로 규정된 욕망의 응결물일 뿐이라는 발견 속에서, 또한 욕망은 끊임없이 그것을 해체하며 숙인 고개를 다시 든다는 그러한 발견 속에서 출구를, 정확하게 출구를 발견하면서 말이다. (자본주의에 대한 [이러한] 투쟁, 파시즘 및 관료주의에 대한 [이러한] 투쟁은, 카프카가 '비판'에 전념했을 경우보다 훨씬 더 강렬한 투쟁이다.) 욕망의 공존하는 이 두 가지 상태는 법의 두 가지 상태기도 하다. 즉 한편으로 그것은 초월적이고 편집증적인 '법'으로서, 유한한 선분을 선동하여 그것을 완성된 대상으로 만들고 여기저기서 결정화한다.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내재적이고 분열적인 법으로서 사법[정의]으로, 반-법으로, 편집증적인 '법'의 모든 배치들을 해체해 버리는 방법으로 기능한다. 왜냐하면 내재성의 배치의 발견과 그것의 해체는 동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기계적 배치를 해체하는 것, 그것은 동물-되기로는 포착할 수도, 창조할 수도 없던 탈주선을 유효하게 창조하고 포착하는 것이다. 그것은 전혀 다른 선, 전혀 다른 탈영토화인 것이다. 이러한 [탈주]선이 정신 속에서만 나타난다고 말해선 안 된다. 마치 글쓰기가 기계가 아니기라도 한 것처럼, 또 마치 그것이 행동이 아니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그것이 출판과 독립적인 경우조차도. 마치 글쓰기 기계는 기계가 아니기라도 한 것처럼(그것은 어떤 것에 대한 상부 구조가 아니고, 어떤 것에 대한 이데올로기도 아니다) 말이다.- 그것은 때로는 자본주의적, 관료제적 내지 파시즘적 기계에 의해 장악되고, 때론 온순한 혁명적 선을 그리기도 한다. 카프카의 항상적인 관념을 상기하자. 즉 문학적인 표현 기계는 그것이 고독한 작동자에 의해 다루어지는 경우에소, 좋든 싫든 전적으로 집합적인 것에 결부되어 있는 조건 속에서 내용을 진전시키고 가속시킬 수 있다. 반 서정주의 -세계 그 자체를 피하[세상으로부터 탈주하]거나 그것을 어루만지는 게 아니라, '세계를 움켜쥐고' 그것으로 하여금 탈주케 하는 것. *질 들뢰즈/ 펠릭스 가타리, 카프카, p.143~144
그러나 그것은 결코 동일한 관계가 아니다. 능동적인 세 가지 요소를 구별해야 할 필요도 있다. 1) 평범한 계열들로서, 그 각각의 계열은 기계의 특정한 선분에 상응하며, 그 각 계열의 항들은 동성애적 지표를 수반하면서 증식하는 관료적 이중체들로 이루어져 있다. (예컨대 수위들의 계열, 하인들의 계열, 관리들의 계열이 그러하다 <성>에서 클람의 이중체들의 증식을 참조.) 2) 젊은 여인들의 유별난[두드러진] 계열로, 그 각각[의 계열]은 평범한 계열에서 유별난 점 그 자체에 상응한다. 그 점이 선분이 개시하는 지점이든, 끝나는 지점이든, 아니면 내적으로 균열되는 지점이든간에 말이다. 이 계열은 원자가의 증대 및 접속의 증대를 수반하며, 다른 선분으로 가속화되고 나아가는 이행을 수반한다. (그것이 바로 성애화 내지 근친상간의 기능이다.) 3) 예술가의 특이적 계열로, 명시적인 동성애를 수반하며, 모든 선분을 넘어서고 모든 접속을 휩쓸어 버리는 연속됨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즉 젊은 여인들은 K로 하여금 선분에서 선분으로 나아가게 함으로써 그의 탈영토화를 보장하거나 '돕지만,' 국지적[일 분인 이] 빛은 언제나 뒤에서, 촛불이나 휴대용 촛불에서 왔다. 반면 예술가는 나는 듯한 연속적 탈주선을 보장해 주었고, 이 경우 빛은 큰 폭포처럼 앞에서 왔다. 젊은 여인들이 기계의 부품들이 접속되는 주요한 점들이었다면, 예술가는 이 모든 점들을 결합하여, 내재성의 장을 뒤덮고 나아가 그 장을 앞질러 가기도 하는 자신의 특별한 기계 속에서 그 점들을 펼쳐 보여준다. [평범한 선분들과 유별한 점들, 특이적 점들 사이의 접속 지점은 어떤 면에서는 미학적 인상을 갖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것은 종종 냄새, 빛, 소리, 접촉 등과 같은 감각할 수 있는 질이거나, 상상력이 빚어낸 자유로운 형상, 혹은 꿈과 악몽의 요소들이다. 그것은 '우연'에 결부되어 있다. 예를 들어 <대리인>이라는 단편에서는 세 개의 접속 지점이 개입한다. 왕의 초상, 아나키스트가 던진 듯한 짧은 문구("야, 너, 거이 그 위에 있는 놈!"), 대중 가요("조그만 램프가 타는 동안")가 그것이다 그것들은 새로이 가지를 뻗어 나가는 양상을 결정하기라도 하는 양 개입하며, 계열들을 증식시킨다. 대리인은 다소간 근접한, 혹은 다소간 거리를 둔 선분들을 형성하면서 무수한 다의적 결합에 관여한다. 그러나 접속의 점들을 그 안에 존속하ㅡㄴ 미학적 인상으로 귀착시킨다면 그것은 커다란 오류일 것이다. 카프카의 모든 노력은 심지어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그의 반서정주의 내지 그의 반미학주의를 특징짓는 공식이다. 즉 인상을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장악하는 것,' 인상 속에서가 아니라 대상, 인물, 사건 속에서 직접 현실에 대해 작업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은유를 죽이는 것. 미학적 인상과 감각 내지 상상이, 프라하학파가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그의 최초의 에세이에서 발견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카프카의 [문학적] 진전 전체는 간결함, 극-현실주의, 기계주의 -이 모두는 미학적 인상이나 은유 같은 것들과 무관한데- 를 위해 그러한 영향력을 지우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바로 이것이 선분 속의 신호기처럼, 혹은 계열들을 구성하는 데서 유별난 점이나 특이한 점들처럼 객관적으로 작동하는 접속의 점들이 주관적 인상들을 체계적으로 대체한 이유다. 여기서 환상의 투영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오해를 가중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이 [접속의] 점들은 여성적인 인물이나 예술가적 인물과 일치하지만, 이 모든 인물은 사법 기계에 의해 규정되는 객관적인 부품이나 톱니로서만 존재한다. 대리인은 자신이 도착적인 교훈을 얻고자 하는 소송을 통해서만 이 세 가지 요소의 연계를 발견하고 그 연계의 모호성과 다의성을 실현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야말로 진정한 예술가다. 소송, 혹은 클라이스트의 말을 빌리면 삶의 계획은 훈육이고 절차지 결코 환상이 아니다. ㅌ티토렐리 자신도, 그가 서 있는 위치의 특이성에서 보자면 여전히 사법적 장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예술가는 미학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예술가 기계와 표현 기계는 미학적 인상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나아가 여성적인 접속이나 예술가적인 접속에 그러한 인상이 여전히 존속하는 한, 예술가 그 자체는 꿈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예술가 기계 내지 표현 기계의 공식은 모든 미학적 의도와 독립적으로 정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계열들 속에 객관적으로 끼어들고 그 극한에 관여하는 여성 인물이나 예술가 인물조차 뛰어넘어 전혀 다른 식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질 들뢰즈/ 펠릭스 가타리, 카프카, p.162~165
하지만 제자리에서 하는 경우에도 탈주는 세상을 피하는 것이 아니며, 탑이나 환상 혹은 인상 속으로 숨는 그런 도피가 아니다. 탈주는 "두 발의 끝으로 자신을 지탱하는 것일 뿐이고, 다만 두 발끝이 이 세상에서 그를 지탱하도록 할 (수 있을) 뿐이다." 범용성에 머무르는 독신자보다 덜 미학적인 것은 없으며[가장 비미학적이다], 그런 독신자보다 더 예술적인 것은 없다[가장 예술적이다]. 그는 세상을 피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움켜쥐고, 그것을 예술적이고 연속적인 선 위로 탈주하게 만든다. "나는 내가 하려는 산책을 할 뿐이며, 그것으로 충분하다. 역으로 내가 산책하지 못한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가족도 없고 부부도 없는 독신자는 그만큼 사회적이고, [기성] 사회에 대해 위협적이며, [기성] 사회에 대해 배반적이고, 그 자체만으로도 집합적이다. ("우리는 법 바깥에 있지만 아무도 그것을 모른다. 하지만 우리 각자는 그렇게 대한다.") 독신자의 비밀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강렬도적 양의 생산, "더러운 작은 편지"처럼 가장 낮은 것으로부터 무제한적 작품처럼 가장 높은 것에 이르는 강렬도적 양의 생산이 그것인데, 그것을 카프카는 사회적 장에서, 사회적 장 자체 안에서 직접적으로 작동시킨다. 이는 하나의 동일한 과정이다. 가장 높은 욕망은 고독함을 욕망하는 동시에 모든 욕망의 기계에 접속되기를 욕망한다. 고독하고 독신적인 만큼 사회적이고 집합적인 기계, 탈주선을 그리는 이 기계는 필연적으로 공동체라는, 아직 그 존재 조건이 현재적으로 주어져 있지 않은 그런 공동체라는 의미를 갖는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개인적인 문제' 라곤 없는 소수적인 문학의 현실적 조건으로 소급되는 표현 기계의 객관적 정의다. 사회적 신체 안에서 강렬도적 양의 생산, 계열들의 증식과 가속화, 독신자가 야기하는 다의적이고 집합적인 접속들, 이것 이외에 [표현 기계에 대한] 다른 정의는 없다. *질 들뢰즈/ 펠릭스 가타리, 카프카, p.166~167
Mass, Massive, Massacre, Massage
배치는 단지 두 측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한편에서 그것은 선분적이고, 여러 인접한 선분 위로 자신을 확장하거나 나름대로 배치를 이루는 선분들로 분할된다. 이러한 선분성은 다소 경직된 것일 수도, 유연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 유연함은 <성>에서 그렇듯이 경직성보다도 더 구속적이고 숨막히는 것이다. <성>에서 인접한 사무실들은 바르나바스로 하여금 좀더 강렬한 야심을 갖게 하는 유동적 장벽만을 가지고 있을 분인 것처럼 보인다. 사람들이 들어간 사무실 뒤에는 항상 다른 사무실이 있고, 눈에 보이는 사람 뒤에는 항상 또 다른 클람이 있다. 선분들은 권력인 동시에 영토다. 선분들은 욕망을 포획하고, 그것을 영토화하며, 그것을 고정시키고, 그것을 사진화하며, 사진이나 딱 달라붙는 옷에 집착하게 만들고, 그것에 임무를 부과하며, 그것으로부터 초월성의 이미지를 추출하여 자신과 그 이미지를 대립시킬 정도로 그것에 사로잡히게 한다.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각각의 선분-블록이 권력, 욕망 및 영토성 내시 재영토화의 구현이라는 것을 보았고, 초월적 법의 추상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도 보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배치는 그런 만큼 탈영토화의 첨점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야 한다. 혹은 동일한 데로 귀착되는 말이지만, 배치는 언제나 탈주선을 가지고 있다고, 이로써 배치는 스스로 탈주하며, 이로써 언표행위 내지 탈분절화된 표현들을 흘러가게 하며, 나아가 그 내용들로 하여금 탈형식화되고 변형되도록 한다고 말해야 한다. 혹은 역시 동일한 데로 귀착되는 말이지만, 배치는 무제한한 내재성의 장 속으로 확장되거나 그것을 관통한다고 말해야 한다. 그 내재성의 장은 선분들을 뒤섞이게 하고 욕망으로 하여금 모든 구현물이나 추상물을 벗어나게 하거나, 최소한 그것들을 용해시키기 위해 그것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쟁하게 한다. *질 들뢰즈/ 펠릭스 가타리, 카프카, p.196~197
1) 이런저런 배치가 '초월적 법'이란 메커니즘 없이 지탱될[작동할] 수 있는 것은 대체 어느 정도 일까?[하는 것이다.] 그것 업시 지탱될 수 없으면 없을수록, 그것은 덜 현실적인 배치, 단어의 첫번째 의미[초월적이고 사물화된 것이란 의미]에서 추상적 기계, 그리고 더욱더 전제적인 것이기 십상이다. 예를 들어 가족적인 배치는 [오이디푸스] 삼각형화 없이 지탱될 수 있을 것인지, 부부 관계의 배치는 이중화 없이 지탱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점에서 이 배치들은 그것으로 기능적인 배치라기보다는 법적인 변환태를 만들 뿐이다. 2) 각각의 배치에 고유한 선분성의 본성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선분들의 경계들은 다소간에 경직되거나 유연하며, 그 증식의 속도 또한 다소간에 빠르거나 느리지 않은가? 선분들이 더 경직되거나 더 느릴수록, 배치는 자신의 연속적인 선 내지 탈영토화의 첨점들을 따라 효과적으로 탈주하기가 더 어렵다. 그 선이 아무리 강하고, 그 첨점들이 아무리 강렬하다고 해도 말이다. 이 경우 배치는 현실적-구체적 배치로서보다는 오히려 지표로서만 기능할 뿐이다. 즉 이 경우 배치는 그 자신을 실행하는 데는, 다시 말해 내재성의 장에 참여하는 데는 도달하지 못한다. 또 [이 경우] 그 배치가 표시하는 출구가 어떤 것이든, 그것은 실패할 운명이며, 이전의 매커니즘에 다시 사로잡히게 된다. 예컨대 <변신>에서 동물-되기의 실패가 유난히 그렇다(가족적 블록의 재구성). 여성-되기는 이미 그 유연성과 증식에서 훨씬 더 풍부한 것처럼 보인다. 어린이-되기는 이보다 더 나아간다. 티토렐리의 작은 소녀들. 카프카에게서 유아기의 블록이나 유아적 매너리즘은 여성적 계열들의 그것보다 훨ㅆ딘 더 강렬한 탈주 밑 탈영토화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3) 선분성의 본성이나 선분화의 속도를 고려할 때, 배치가 자신의 고유한 선분을 넘어설 능력(attitude)은, 다시 말해 배치가 탈주선으로 스스로 밀려 들어가 내재성의 장으로 확산되어 갈 능력은 어떠한가? [하는 것이다.] 어떤 배치는 유연하고 증식하는 선분들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이 전제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계적인 것인 만큼 억압적이고, 그런 만큼 더 거대한 권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내재성의 장으로 흘러드는 대신, 그것[앞서의 배치]이 이번에는 내재성의 장을 선분화한다. <소송>의 허위적 종결은 전형적인 재삼각형화를 작동시키기조차 한다. 그러나 이러한 종결과는 별도로 모든 선분적 사무실들을 지워 버리는 무제한한 내재성의 장, 종결로서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라 각각의 한계와 각각의 순간마다 이미 거기에 있는 그런 내재성의 장을 향해 자신을 개방하는 데서 <소송>이나 <성>의 배치가 보여 주는 능력은 어떤 것인가? 오직 이러한 [내재성의 장을 향한 개방이라는, 혹은 같은 말이지만 탈주 내지 탈영토화 능력이라는] 조건 아래서만, 그것은 배치 안에서만 실현될 수 있을 뿐인 추상적 기계(두번째 의미인 초월적이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추상적 기계(두번째 의미인 내재적이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추상적 기계로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 문학적 기계의 능력, 언표행위 및 표현의 배치의 능력은 어떠한가?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소수적인 문학의 조건은 또 어떠한가? 카프카의 작품을 양화하는 것은, 강렬도적 양에 대해 이 네 가지 기준을 이용하여 가장 낮은 것에서 가장 높은 것에 이르기까지 그때마다 상응하는 모든 강렬도를 산출하는 것이다. 이것이 K의 기능이다. 이것이 바로 카프카가 했던 것이고, 이것 바로 그의 연속적인 작품인 것이다. *질 들뢰즈/ 펠릭스 가타리, 카프카, p.199~201
나는 먼저 집에서 작업을 하기로 했다. 부모님께서 살고 계신 수원 집이었고 그곳의 베란다에서 고프로를 머리에 달고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나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을 때 촬영을 시작했다. 무엇을 할 수 있을 지는 몰랐지만 우선 베란다에서 눈에 띄는 것들을 촬영했다. 집은 아파트 4층에 위치하여 아파트 단지 내 나무들의 키보다 약간 높거나 혹은 엇비슷했다. 베란다의 끝에는 조그만 창고 같은 것이 있었고 안쪽으로는 안방이 있었다. 안방의 침구들은 가지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베란다 천정에 매달린 빨랫대에는 약간의 속옷들과 말린 마늘이 걸려 있었다. 그 베란다는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들의 화장실이기도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나는 어떤 액체를 밟자마자 그것이 소변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옆에 있는 샤워기로 씻었다. 그곳을 어느정도 살펴본 후 나는 거실과 연결되어 있는 발코니로 이동했다. 그곳에는 화분들이 많았고 거실이 보였다. 거실에는 우선 넓은 소파가 있었고 그 위에는 반려견 한 마리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나는 그 위치의 전도가 재미있었다. 반려견은 거실의 중앙 가장 높은 곳에 있었고 나는 바깥에서, 바깥과 거실 사이의 공간에서 그 개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후 거실에서 안방으로 들어가는 문에 쳐진 울타리가 생각났다. 이 울타리는 반려견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부모님께서 설치해 놓은 울타리였다. 울타리의 높이는 대략 내 무릎 정도 됐다. 이 울타리는 안방의 입구에만 설치되어 있었다. 그 문의 맞은 편에는 내 방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그 사이에 가족사진이 걸려있다. 현관문에서 들어왔을 때 정면으로 보이는 위치에 이 가족사진이 걸려있다. 나는 가족사진 앞에서 다시 촬영을 시작했다. 반려견 중 다른 한 마리가 내 주변을 맴돌았고 나는 개의 시점에서 울타리를 촬영해보고자 앉아서 울타리와 맞은 편의 내 방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나는 그렇게 집 안의 이곳 저곳을 돌아보다가 그 반려견들이 가장 눈에 띈다는 사실에 주목했고 그래서 동물원으로 가 촬영을 해보고자 했다.
나는 동물원을 혼자 종종 가고는 했다. 서울대공원은 어릴적 부모님께서 자주 데려가신 곳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지 약간의 안정감이 들었기에 홀로 비교적 조용한 시간대에 동물들을 관찰하기 위해 사람이 없는 시간대에 주로 가고는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봤다. 그 분위기를 체감하거나 동물들을 관찰하기보다 동물들을 관찰하는 사람들이 궁금했다. 마치 반려견들을 키우는 부모님처럼, 혹은 이 반려견들을 촬영하고 있는 나와 같은 사람들은 과연 동물원에서는 어떻게 행동하는 지가 궁금했다. 그 경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또한 궁금했고 말이다. 이 곳에서 동물들은 반려동물이기보다는 전시물에 가깝다. 살아있는 전시물 말이다. 강아지들은 말그대로 애완견이다. 이 애완견과 동물원 우리 속의 동물들은 분명 다르다. 그러나 공통점은 무엇일까? 그 다름의 기준이 인간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이들이 동물이라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인간 또한 동물이지 않나? 과연 그 경계지어진 구역들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존재인가? 혹은 생태계에서 경계지어진 구역들에 의해 스스로 갇혀있는 존재가 인간이지 않을까? 또한 동물원은 주로 가족들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곳이다. 나같은 경우는 어릴적 사진을 돌이켜 봤을 때 기억이 닿을락 말락하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서 데리고 가셨다. 즉 동물을 대상화함으로서 혹은 그 대상화된 개념적 경계를 학습함으로써 나는 인간이라는 의식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 밖에 없지 않은가? 나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동물은 아니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인간이면서 동물이다. 과연 가능할까?
동물원에 다녀온 후 2주 정도 뒤, 나는 동물원 옆에 있는 미술관에 갔다. 미술관에서는 별다른 전시를 하고 있지는 않았다. 백남준의 <다다익선>이 보수작업을 거치고 모습을 드러냈고 바깥에는 여느때처럼 사람들이 나들이를 하고 있었다. 주로 나이가 지긋한 중년 이상의 어르신들이 많이 보였다. 미술관 안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말이다. 물론 연령대가 다양했지만 동물원에서는 잘 볼 수 없었던 어르신들이 있었다. 이건희 컬렉션 전시가 진행되고 있어서 나는 관람을 했다. 사실 촬영 목적이 아니었다면 가지 않았을 것이다. 애초에 사람들이 몰리는 곳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예전에 삼성 용인 수장고에서 알바를 하며 지긋지긋하게 봤던 작품들이라 그렇게 궁금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몰렸기에 그 사람들을 관찰하고 싶었다. 전시실은 원형으로 되어있었고 마침 다른 주 전시실들에서는 전시가 진행되지 않아 원형 공간들이 유독 눈에 띄었다. 이건희 컬렉션의 작품들은 주로 프랑스 인상주의 작품들과 피카소의 도자기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다. 작년의 인기가 약간 식어서인지 사전예약을 하지 않고도 줄을 서면 관람을 할 수 있었다. 원형 전시실의 중심에는 영상들이 상영되고 있었고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대화를 하기도 하고 영상에 집중하기도 하고, 혹은 이리저리 옮겨다니기도 했다. 전시실의 조명이 상당히 어두워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은 것 치고는 분위기가 차분했다. 그리고 원형 관람로의 끝에는 이건희 회장의 예술에 대한 공헌 같은 것이 벽에 글로 써져 있었다. <다다익선>의 tv도 삼성, 이걸 찍는 사람들의 핸드폰도 삼성, 아무튼 테크놀러지와 매스미디어, 문화자본주의 등등을 생각하며 미술관을 나왔다. 백남준의 작품도 마치 판옵티콘을 작동시키는 기술발전의 디스토피아적 기념물처럼 보이기도 했고 말이다.
나는 미술관을 나와 발걸음을 옮겨 놀이공원으로 갔다. 그 날은 할로윈 전의 토요일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오후 4시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꽤 많았다. 오랜만에 가는 서울랜드였다. 아마 9살, 혹은 10살 이후로는 처음 가는 서울랜드였다. 미술관에서 서울랜드로 가는 길부터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의 들뜬 목소리가 들렸다. 서울랜드를 둘러싼 펜스 너머로는 아이들의 비명 소리와 함께 바이킹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할로원을 테마로 놀이공원 곳곳이 장식되었고 동물원이나 미술관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그곳에서 돌아다니는 아이들은, 특히나 가족이 아닌 친구들끼리 놀러온 아이들은 뭔가 야생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다. 서울랜드로 가면서 들었던 생각은 왜 사람들은 공포심을 즐길까? 라는 의문이었다. 하지만 당시를 돌이켜보면 딱히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었던 것 같지는 않다. 이러한 공포심을 생산하면서 통제하는 기계와 이를 통해 더 큰 자극을 욕망하는 인간이라는 기계, 이런 생각들이 들었다. 아이들은 놀이기구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소리를 지르며 즐긴다. 그리고 부모들은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며 사진을 찍어주며 즐거워 한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생각보다 적나라하게 각종 광고들이 판을 치고 있었다. 각종 과장된 형상들, 사실 거의 역겨울 정도의 키치한 이미지들과 건물들, 그리고 사람들. 유독 서울랜드가 다른 놀이공원들 보다 더 그런것 같기도 하고 말이다. 아무튼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는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놀이기구를 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작업을 제대로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저 기계적으로 놀이기구들을 고프로로 촬영하고 있었다. 발은 점점 지쳐가고 말이다. 놀이공원을 나와 우선 봉천동에 있는 집으로 가고자 전철역으로 향했다. 이태원을 갈까말까 생각하고 있었지만 우선 고프로를 충전해야만 했다. 전철을 탔다. 다음역은 경마공원역, 쉰내와 각종 쩐내가 뒤섞인 아저씨들이 들이닥쳤다. 다음역에서 한껏 치장을 하고 자신들이 뿌린 향수가 아저씨들의 냄새에 의해 없어질 것을 걱정하는 여성 두분이 탔다. 그 분들은 이태원으로 가고 있었다. 사실 나는 이태원에 오늘 사람이 많이 몰릴지 반신반의하고 있었는데 그 분들의 대화를 듣고 이태원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봉천동에 도착해서 고프로를 1시간 가량 충전시키고 옷을 갈아입었다. 렌즈도 끼고 말이다. 뭔가 고프로를 머리에 쓰고 사람들이 많은 곳을 촬영하는데 너무 찐따처럼 보이면 안될 것 같았다. 시비가 걸릴것 같기도 했고 말이다. 여자친구에게는 전날에 미리 갈지말지 고민중이라고 미리 언지를 주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한번 전화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선 삼각지역으로 향하는 버스를 타고 여자친구와 통화를 했다. 나는 버스 안에서 꽤 설렜는데 사실 무슨 일이 생길지 몰랐기 때문이다. 아는 사람과 우연히 마주칠 수도 있고 그래서 신나게 놀 수도 있는 가능성을 상상해봤다. 앞서 말한것 처럼 촬영을 하다 누군가에게 시비가 걸리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다. 이런 것들이 뒤섞이며 약간의 스릴을 가져왔다. 아무래도 놀이공원에서 촬영이 썩 만족스럽지 못했던 상황도 한몫 했던 것 같다. 여자친구는 내색하진 않았지만 내가 렌즈까지 끼고 이태원에 가는것을 괜찮아 하는것 같지는 않았다. 나 스스로 좀 찔리는 구석도 있었고 말이다. 그렇게 통화를 간당간당하게 하던 도중에 기사님이 삼각지역부터 집회 때문에 차량이 통제되어 그 전에 내려야 한다고 했다. 나는 마침 잘됐다 싶었다. 여자친구와의 찝찝한 통화를 그만 할 수도 있었고 이태원에 평소 사람이 몰리는 시간보다는 좀 이른 감이 있었기에 집회 장면을 촬영하고 가면 딱 맞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삼각지역에 도착하니 경찰들이 겹겹이 깔려있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는 태극기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끝물이었다. 대부분 어르신들이었고 젊은 분들도 나보다 나이가 많아보였다. 다들 상당히 거칠었다. 외치는 구호며, 행동이며. 이태원으로 이동하기 위해 전철역 안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분은 앞뒤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밀치기도 했다. 아무튼 이태원역에서부터 본격적인 촬영을 하기보다는 먼저 녹사평역에 내려서 경리단길로 가며 분위기를 좀 보고자 했다. 사실 당시에는 사람이 어디에 많이 몰리는지도 잘 몰랐고 초반부터 고프로를 쓰고 돌아다니기에는 좀 머쓱해서 경리단길을 따라 주택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녹사평역에서 이태원역으로 가는 길목으로 내려왔다. 이태원역으로 가는 길에는 사람이 엄청 많았다. 길가에 좌판 같은 것을 깔아놓고 분장을 해주는 사람들도 많았고 아무튼 예상했던 것보다 다들 분장들을 열심히 해왔다. 뭔가 이태원으로 가기전에 생각했던 것이 놀이공원에서 봤던 어린아이들이 그대로 커서 인간 전시장을 형성하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전시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휙휙 지나갔고 사람들과 나와의 거리가 지나치게 가까웠다. 아무튼 다들 들떠있는 분위기였다. 나 또한 그랬고 말이다. 굉장히 행복해보였다. 그러다 해밀턴 호텔 쪽으로 가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렸다. 앞으로 가기가 거의 힘들었는데 그래서 차도를 건넜다가 다시 건너와 해밀턴호텔 뒤쪽으로 들어가는 길목으로 진입했다.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차도에는 지속적으로 차들이 다니도록 하는 것이 신기했다. 아무튼 해밀턴 호텔의 뒤쪽에는 클럽들이 늘어서 있었고 그곳들이 할로인의 메인 구경거리인듯 했다. 클럽 안에는 매력적이라기보다는 클러버같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며 빠른 비트의 음악과 함께 춤을 추고 있었다. 그 안에는 주로 여성들이 많았다. 그 안에 있는 남성들은 주로 인스타에서 볼법한 잘생기고 약간은 도화살이 있는, 그리고 날씬하고 말쑥한 그런 사람들이었다. 클럽에서 자체적으로 물관리를 하는것 같았다. 말그대로 인간 전시장이었는데 시선을 계속 그곳에 두고 뚫어져라 보기에는 약간 민망하기도 했다.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 셀카를 찍고 있었다. 마치 자신들의 코스튬을 기념하기라도 하는듯 말이다. 나는 일단 진입을 했으니 되돌아 가는 것은 힘들겠다 싶었고 일단 사람들의 흐름에 몸을 맡겼다. 브론즈와 프로스트, 글램이 있는 구간에 들어서자 그 분위기는 더욱 격해졌다. 마치 클럽 안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포함한 거리에 몰려있는 군중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건물의 루프탑 같은 곳에서는 사람들이 그 군중들을 구경하고 있었다. 구경과 구경과 구경의 연쇄고리들. 딱 그 느낌이었다. 군중들 중에는 주로 남자들이 많았다. 여느 주말 클럽 분위기처럼 말이다. 헌팅하러 나온 내 또래, 혹은 나보다 조금 어려보이는 남자들이 많았고 여자들도 굉장히 많았다. 격한 코스튬을 한 사람들은 주로 외국인들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주로 클럽갈때 하는 복장에 얼굴에 상처같은 할로윈 분장을 하거나 머리띠같은 것을 하는 그런 풍경이었다. 그리고 한국에서 볼 수 있는 외국인이란 외국인도 나 나온것 같았다. 물론 그 구간에서는 어린이들은 볼 수 없었다. 바깥의 도로에는 상당수 보였는데도 말이다. 나의 경우는 그런적은 없지만 마치 홍등가를 지나는 기분이었다. 그러다 와이키키 비치 펍이 있는 삼거리에 들어서자 밀집도가 더 높아져 나는 팔꿈치를 앞으로 모으고 공간을 확보해서 앞사람들을 따라갔다. 옷에 분장들이 묻을까봐 그랬다. 그때부터는 발도 계속 밟히고 뒷사람의 몸도 압력에 의해 나에게 계속 닿았는데 그것이 묘한 쾌감같은 것을 주었다. 사람들이 밀리니 이런저런 비명소리들이 들렸다. 주로 여성분들의 목소리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클럽 안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거리의 스펙타클에 한눈이 팔려 있었다. 그 비명소리조차도 그러한 재미의 일부였던 것 같기도 하고 말이다. 어떤 남성들은 소리를 어어어이~와 같이 지르면서 앞사람을 무식하게 밀고 나갔다. 삼거리가 지나면서부터는 재밌기보다는 답답한 느낌이 강했다. 뭔가 동물원안의 원숭이가 된 기분이었고 사람들은 건물 위에서, 그리고 길가에서 그런 나를 술이 취한채 구경하는 것 같았다. 외국인 남성들은 굉장히 거만했다. 마치 자신들이 이 거리의 주인인양 사진을 찍고 지나가는 여성들을 관찰했다. 나는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내 고프로를 의식하지는 않을지 생각했지만 행렬에는 긴 셀카봉을 이용해 촬영을 하고 큰 카메라를 가져와 촬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고프로 정도는 애교였다. 발도 계속 밟히고 사람들과 부딪히는 강도도 더욱 격해지니 처음에는 그것이 재밌다가 조금씩 기분이 안좋아지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어느 지점에서 그 행렬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다시 주택가로 올라갔다. 주택가로 올라가서 촬영은 이정도면 됐겠다 싶었지만 해밀턴 호텔의 건너편까지만 찍으러 가보고자 했다. 조용한 주택가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길에 다시 내가 진입했던 길목을 지나갔는데 몰려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바퀴벌레나 인간이나 다를게 없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 웃기기도 했고 말이다. 그러면서 계속 군중 속으로 가고자 하는 내 자신이 아이러니했던 것 같다. 건너편, 그러니까 보광동쪽으로 가는 동네에는 물론 사람들이 많았지만 길목이 비교적 좁아서, 그리고 차도와 함께 있어서 앞으로 가는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 좀 더 올라가니 트렌스젠더, 게이 바들이 있는 곳이 나왔다. 그곳들도 다른 클럽들과 다름없는 분위기였다. 다만 인구 밀도는 평시 금요일, 토요일 클럽에 있는 정도였다. 구경하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았다. 그곳에서는 고프로로 촬영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것이 눈치가 보여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다니며 빠져나왔다. 눈치를 주는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뭔가 그곳에서 카메라를 가지고 다는 사람은 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곳을 빠져나와 이슬람 사원을 지나갔다. 이슬람 사원 주변의 외국인들은 주로 무슬림들처럼 보였는데 사람이 많이 나오거나 축제 분위기까지는 아니지만 다들 들떠 있는 모습이었다. 그렇게 나는 한강진역으로 향했고 사람들은 끊임없어 이태원역 쪽으로 가고 있었다. 나도 그냥 그 분위기를 즐겼다. 그렇게 지하철역으로 가면서 혼자 셀카도 몇 장 찍고 말이다. 셀카를 보는데 표정이 좀 슬퍼보였다. 아무래도 혼자 가니 좀 헛헛한 느낌이 없지는 않았다. 나처럼 혼자 온 사람들은 거의 없는듯 했다. 아무래도 촬영 차 갔으니 술은 마시지 않았고 괜히 정신을 뺏기기 싫어 편의점에서 제로콜라만 하나를 사서 마셨다. 그리고 봉천동에 도착해서 맥주 한캔과 단팥빵을 하나 사고 집에서 혼자 먹었다. 그러면서 혼자찍었던 셀카를 인스타에 올렸다. 그때가 아마 11시 반쯤으로 기억하는데 게시물을 올리자마자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다. 지금 이태원에서 난리가 났다고 말이다. 그래서 나는 바로 게시물을 내리고 천만다행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친구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상황을 보니 정말 난리가 났다. 내가 여길 갔다온게 맞나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죽어있었다. 그리고 나서 드는 감정은 우선 게시물을 금방 내린것에 대한 안도감, 그리고 올라온 영상에서 소방관들의 cpr이 마치 클럽음악에 맞춰 리듬을 타는것처럼 보일때 느껴지는 웃김, 그리고 고프로를 보며 작업소스로 뭔가 한건 했다는 희열같은 것이 있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슬픔, 당혹감, 괴로움같은 것은 없었다. 단지 재밌고 아이러니하고 그러면서 나와 아다리가 어떻게 이렇게 맞을 수 있지 하는 일종의 기분좋음이 지배적이었다. 약간 카타르시스같은 것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면서 뭔가 골치가 아프겠다는 생각도 들고 말이다. 이후 며칠동안 뉴스에서 각종 애도 기사들이 뜨는 것을 보면서 그저 웃겼다. 사실 지금도 일정 부분은 그렇다. 전혀 화가 나거나 그렇지 않다. 어떻게든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재미있다. 특정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우려 한다. 그러고 잊으려고 발버둥치겠지. 나도 마찬가지다. 인스타에 게시물을 올린 얼마 안되는 시간동안 그것을 본 몇몇 사람들은 나를 정신나간 놈 취급하겠지? 이런 생각들부터 들면서 대학원에 들어와 유지한 관계들에 누군가 크랙을 내기 시작할 것이란 생각도 들고 아무튼 이런저런 망상들을 하는데 한가지 정말 다행인 것은 속단할 수는 없지만 나를 5년동안 괴롭혀왔던 관계에 대한 기억 하나로부터 신기하게도 말끔히 정을 뗄 수 있었다는 점이다. 사실 나는 지난 7월부터 인스타를 하면서 이런저런 고민이 많았다. 단순히 이 sns라는 플랫폼을 대상화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무튼 발을 들이니 잘 나갈 수도 없는 그런 곳이었다. 아무튼 얼마전 대학원을 같이 다니던 몇몇 동료들은 현재 젊은 사람들의 미술씬에서 이런저런 전시 설치 일들을 도와주며 인맥을 쌓던 어떤 사람이 주최한 파티에 참여했고 그것을 인스타에 너도나도 올렸다. 나는 그곳에 갈 수 없었다. 그 주최자의 현 여친은 내가 5년전에 안좋게 매달리던 사람이었고 학교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5년 동안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계를 단절당해야만 했다. 나는 그 주최자를 모른다. 어찌됐든 그 파티에 갈 수 없는 것은 매한가지이지만 동료들이 올리는 게시물들을 보니 내가 다시 배제당한다는 느낌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다. 내가 매달리던 그 친구는 어떤 방식으로든 나에게는 관계에 있어 유리천장 같은 사람이었고 나는 그 친구와 연관된 사람들을 마주칠때면 항상 배제당하고 투명인간 취급을 당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고 안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말이다. 아무튼 그 파티와 이태원 사건의 연관성은 없겠지만 이태원에서 개판이 난 상황을 보니 내가 어쩌지 못하는 족쇄에 붙잡혀 있다는 압박감에서 오히려 벗어나는 것 같다. 그 재수없는 dj파티들을 한동안은 보지 않아도 될것 같기도 하고 말이다. 5년 동안 그렇게 벗어나고자 발버둥을 쳤는데 오히려 얽매여 진창으로 빠지다가 정말 우연한 사건으로 인해 빠져나온 느낌이다. 아무튼 뭐 그 친구가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 단지 내가 그녀에게 가졌던 죄책감, 분노, 내가 참고 견뎌야 한다는 마음가짐, 그것에 대한 부질없음, 그런 감정들이 불쑥불쑥 은연중에 튀어나올 것이라는 불안함, 원인모를 질투, 아닌척 해야한다는 자존심 등등이 정말로 숙변 내려가듯 미련도 없이 사라졌다. 다시금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는 장담할 수 없겠지만 말이다. 이 고프로 영상들로 작업을 할지 안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나 스스로가 이제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더이상 과거에 얽매여 그것에 대해 집착을 할 필요성도 혹은 그런 압박감도 느끼지 못한다. 내가 이상한건가. 아무튼 내 입장에서 보자면 사실 클럽이 문제다. 클럽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이 작동하는 방식이 사람들을 끌어들였고 클럽은 그것을 통해 이윤을 얻는다. 경찰의 대응은 이차적인 문제다. 버닝썬 사건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클럽 문화는 죽지 않았다. 오히려 그러한 범법성이 사람들을 매혹시키고 끌어들인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 클럽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면 끌어들일수록 그리고 모든 sns와 장소들은 사람을 끌어들이면 끌어들일수록 이윤을 얻는다. 결국 매스에 따라 그 사람의 권위가, 그리고 장소의 권위가, 그리고 네트워크의 영향력이 형성된다. 그리고 매스는 그러한 경계에 대한 매혹에서 자유롭지 않다. 새로움, 유행과 같은 문제들도 마찬가지이고 말이다. 왜 군중들을 통제할 방법만을 생각하고 군중 자체가 그렇게 과도하게 모이는 현상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는 것인가? 우리시대의 이데올로기는 단순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대중문화라는 형태로 확고하게 이미 자리잡힌 것은 아닐까? 매스는 단순히 군중을 끌어모으는 자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그 자력은 배제에 의해서, 그리고 누군가에게 수치심을 부여함으로서, 혹은 공포감을 투사하면서 생산되기도 한다.
기관없는 몸은 신이 아니다. 차라리 정반대다. 하지만 기관 없는 몸이 생산 전부를 끌어당겨 기적을 낳는 마법적 표면 노릇을 하고, 생산 전체를 자신의 모든 분리 속에 기입할 때, 이 몸을 가로지르는 에너지는 성스럽다. 이로부터 슈레버가 신과 유지한 이상한 관계들이 생겨난다. 당신은 신을 믿습니까? 하고 묻는 사람에게 우리는 정확히 칸트 내지 슈레버 방식으로 이렇게 답해야 한다. 물론 믿습니다만, 단지 분리 삼단논법의 대가로서, 이 삼단논법의 선험적 원리로서 믿을 뿐입니다(신은 현실의 총체로 정의되며, 파생된 현실들은 모두 이것의 나눔에서 비롯된다). *질 들뢰즈/ 펠릭스 가타리, 안티오이디푸스, p.70
욕망의 등록은 오이디푸스 항들을 경유할까? 분리들은 욕망적 계보학의 형식이다. 그러나 이 계보학은 오이디푸스적일까? 이 계보학은 오이디푸스 삼각형화 속에 자신을 기입할까? 아니면 오이디푸스란, 그것을 사방으로 빠져나가는 계보학적 질료 및 형식을 사회적 재생산이 길들이기로 작정한 이상, 사회적 재생산의 요구 내지 결과가 아닐까? p.41
슈레버의 상위의 신 아래에서 아빠를 발견해야만 하는데 그렇다면 하위의 신 아래에서 형을 발견하면 왜 안 되는가라고 정신분석가는 말한다. p.42
기관 없는 충만한 몸은 그것의 자기-생산, 자신에 의한 그것의 발생을 증언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부모에 의해 생산되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분열자는 늘 뒤뚱거리지만 금방 바로 선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에게는 그 어떤 분리들에서건 모든 측면에서 모든 것이 똑같기 때문이다. 이는 기관-기계들이 기관 없는 몸에 매달려도 소용없다는 말이다. 기관 없는 몸은 어디까지나 기관들이 없는 채로 있으며 보통 의미의 유기체로는 되지 않는다. 그것은 유동적이고 미끄러운 성격을 유지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생산자들이 슈레버의 몸 위에 자리 잡고 거기에 매달린다. 그가 끌어당기는, 수천의 작은 정자를 담은 태양 광선 같은 것들 말이다. 광선들, 새들, 목소리들, 신경들이 신 및 신의 나뉜 형태들과 복합적이고 교체 가능한 계보학적 관계들을 맺는다. 하지만 모든 일이 벌어지고 등록되는 것은 기관 없는 몸 위에서이다. 생산자들의 짝짓기들, 신의 나눔들, 바둑판 모양의 계보들 및 이것들의 교체들마저도, 사자의 갈기 속에 이들이 있듯이, 모든 것은 창조되지 않은 이 몸 위에 있다. p.44
<과정>이란 말의 의미에 따르자면, 등록은 생산으로 복귀하지만, 등록의 생산 자체는 생산의 생산에 의해 생산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소비는 등록을 뒤따르지만, 소비의 생산은 등록의 생산에 의해 등록의 생산 안에서 생산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소비는 등록을 뒤따르지만, 소비의 생산은 등록의 생산에 의해 등록의 생산 안에서 생산된다. 기입 표면에 주체의 차원에 속하는 어떤 것이 눈에 띄게 되니 말이다. 그것은 이상한 주체이다. 고정된 정체성이 없고, 기관 없는 몸 위를 방황하며, 즐 욕망 기계들 곁에 있고, 생산물에서 차지하는 자신의 몫에 의해 정의되며, 도처에서 생성 내지 아바타라는 덤을 얻고, 자신이 소비하는 상태들에서 태어나고 또 각 상태마다 다시 태어나니까. <따라서 그것은 나다, 따라서 그것은 내 것이다....> 맑스의 말처럼, 괴로움마저도 자기 향유이다. 분명 모든 욕망적 생산은 이미 즉각 완수이자 소비이며, 따라서 <쾌감>이다. 하지만 각 나눔의 여분들 속에서 등록 표면의 분리들을 통해서만 자기 자리를 정할 수 있는 하나의 주체에게는 아직 그렇지가 않다. 법원장 슈레버는 언제나 이 점을 가장 생생하게 의식하고 있다. 우주에는 일정한 향유 비율이 있어, 신은 슈레버가 여자로 변하는 대가를 치러야만 쾌감을 얻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쾌감 중 법원장이 체험하는 것은 그의 고통의 보수 또는 여자-생성의 보상으로서 잔여의 몫뿐이다. <이 향유를 신에게 바치는 것은 내 의무이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관능적 쾌락이 조금 나에게 굴러떨어진다면, 몇 해 전부터 내 운명이었던 지나친 괴로움들과 궁핍들에 대한 약간의 보상으로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당하다고 나는 느낀다.> 생산 에너지로서의 리비도의 일부가 등록 에너짖로 변형된 것과 마찬가지로, 등록 에너지의 일부는 소비 에너지로 변형된다. 바로 이 잔여 에너지가 무의식의 셋째 종합을, <따라서 그것은.....이다>라는 결합 종합 또는 소비의 생산을 추동한다. p.46
하지만 독신 기계 자체는 편집증 기계가 아니다. 그 둘은 톱니바퀴들, 견인차, 끌들, 바늘들, 자석들, 광선들이 서로 다르다. 독신 기계는 그것이 주는 체형들 또는 죽음에서까지도 새로운 무언가를, 태양의 권력을 드러낸다. 둘째로, 여기서 일어나는 변모는, 비록 그 기계가 최고의 기입들을 실효적으로 은닉하고 있긴 해도, 그 기계가 은닉하고 있는 기입으로 인해 지니는 기적을 낳는 성격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 마치 기계적 에로티즘이 다른 무제한적 권력들을 해방하기라도 하듯, 새 결연, 새 탄생, 눈부신 황홀 같은 혼례가 맺어지는 이 새 기계의 현행적 소비가, 즉 자기 성애적 또는 차라리 자동 장치적이라 할 수 있을 쾌락이 존재한다. p.48
기관없는 몸은 알이다. 알은 축선들과 문턱들, 위도들, 경도들, 측지선들이 가로질러 간다. 알은 생성들, 이행들, 거기서 발전될 행선지들 따위를 표시하는 기울기들이 가로질러 간다. 여기서 그 무엇도 재현이 아니다. 모든 것은 삶이고 체험이다. 젖가슴이 체험하는 감정은 젖가슴을 닮아 있지 않으며, 젖가슴을 재현하지도 않는다. 이는 마치 알 속의 한 예정된 지대가 거기에 들어설 기관을 닮지 않은 것과 같다. 거기에는 내공대들, 퍼텐셜들, 문턱들, 기울기들밖에는 없다. 이것은 애절하고 너무나 감동적인 경험으로, 이를 통해 분열자는 물질에, 물질의 강렬하고 생생한 중심에 가장 가까이 있게 된다. <이 감정은 정신이 그것을 찾는 특정한 지점 바깥에 있다.(......) 이 감정은 정신에게 물질의 아주 놀라운 소리를 들려주며, 영혼 전체는 거기로 흘러 그 작열하는 불 속으로 들어간다.> p.50
즉 어떻게 정신분석은 이번에는 신경증자를 아빠-엄마만을 영원히 소비하고 다른 것은 일절 소비하지 않는 불쌍한 피조물로 환원해 버리는 걸까? 어떻게 <따라서 이것은 그것이었다!>, <따라서 이것은 나다!>라는 결합 종합을 <따라서 이것은 내 아버지다, 따라서 이것은 내 어머니다....>라는 오이디푸스의 영원하고 서글픈 발견으로 환원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아직 이 물음들에 답할 수 없다. 우리는 다만 순수 내공들의 소비는 어떤 점에서 가족 인물들에 낯선지, 그리고 <따라서 이것은 ......이다.>라는 결합 직조는 오이디푸스적 직조에 얼마나 낯선지를 볼 뿐이다. 이 삶의 운동 전체를 어떻게 요약하랴? 첫째 길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기관 없는 몸 위의 분리 점들은 욕망 기계들 주위에서 수렴원들을 형성한다. 그러면 기계 곁에서 잔여로서 생산된, 즉 기계에 인접한 부속물 내지 부품으로서 생산된 주체는, 그 원의 모든 상태를 경유하고 한 원에서 다른 원으로 이행한다. 주체 자신은 기계에 의해 점유된 중심이 아닌 가장자리에 고정된 정체성 없이 있으며, 중심에서 늘 벗어나고, 자신이 경유하는 상태들로부터 귀결된다. p.51
<원심력들은 결코 중심에서 도망가는 게 아니며, 중심에서 다시 멀어짇기 위해 새로 중심에 접근한다. 이렇게 격렬하게 진동하기 때문에, 그것들은 개체가 자기 자신의 중심만을 찾고 그 자신이 일부를 이루고 있는 원을 보지 못하는 한 그 개체를 뒤죽박죽으로 만든다. 왜냐하면 이 진동들이 그를 뒤죽박죽으로 만든다면, 그 까닭은 그 진동 하나하나가, 발견할 수 없는 중심의 관점에서 보면, 그가 믿는 것ㄷ과는 다른 어떤 개체에 대응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이란 본질적으로 우연한 것이며, 이 개체 또는 저 개체의 우연성이 개체성들을 모두 필연적이 되게 하려면 개체성들의 한 계열이 각자에 의해 주파되어야만 한다.> p.52
타인의 끊임없는 침습과 파괴를 받아칠 수 없는 유폐된 상태. 나는 어떻게 나의 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 혹은 어디까지 나의 공간을 뺏길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스스로를 완전히 포기하여만 할 것인가.
다른 두 절단과 마찬가지로, 주체 절단은 결핍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와는 반대로 주체에게 몫으로 돌아오는 부분, 주체에 여분으로 돌아오는 수입을 가리킨다.(여기서 한 번 더, 거세라는 오이디푸스 모델은 얼마나 나쁜 모델인가!) 절단들은 분석의 사실이 아니다, 절단들 자체가 종합들이다. 나눔들을 생산하는 것은 종합들이다. 아이가 트림할 때 젖이 되올라오는 예를 생각해보면 좋겠다. 그 젖은 연합적 흐름에서 채취한 것의 반환인 동시에, 기표 사슬에서 이탈한 것의 재생산이요, 주체 고유의 몫으로 주체에 회귀하는 잔여물이다. 욕망 기계는 은유가 아니다. 그것은 이 세 양태에 따라 절단하고 절단되는 자이다. 첫째 양태는 연결 종합에 관련되며, 리비도를 채취 에너지로 동원한다. 둘째 양태는 분리 종합에 관련되며, 누멘을 이탈 에너지로 동원한다. 셋째 양태는 결합 종합에 관련되며 볼룹타스를 잔여 에너지로 동원한다. 바로 이 세 양상 아래에서 욕망적 생산의 경과는 생산의 생산인 동시에 등록의 생산이고 소비의 생산이다. 채취하기, 이탈하기, <여분 남기기> -이것이 생산하기이며, 욕망의 현실적 작업들을 수행한다. p.82
욕망적 생산은 순수 다양체, 말하자면 통일체로 환원될 수 없는 긍정이다. 우리는 부분대상들, 벽돌들, 잔여물들의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는 고대 조각상의 조각들처럼 완성되고 다시 모여, 기원에 있는 통일체 같은 통일체를 만들기를 기다리는 저 사이비 파편들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 더 이상 우리는 기원의 총체성도 목적지의 총체성도 믿지 않는다. 우리는 조각들을 평화롭게 만든다고 주장하는, 칙칙한 변증법적 진화의 잿빛 어조를 더는 믿지 않는다. 이 어조는 조각들의 가장자리를 깎아 두루뭉술하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총체성들을 곁으로 밀려났을 때에만 믿는다. 만일 우리가 부분들 곁에서 이러한 총체성을 만나다면, 그것은 이 부분들의 전체이기는 하나 이부분들을 총체화하지는 않으며, 이 부분들 전체의 통일체이기는 하나 이 부분들을 통일하지는 않으며, 따로 조성된 새 부분으로서 지금까지 있어 온 부분들에 덧붙는다. <통일성이 이번에는 영감을 받아 태어나, 별도로 구성된 하나의 파편과 같은 집합체에 적용된다>라고 프루스트는 발자크 작품의 통일성에 대해, 또 자기 작품의 통일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문학 기계에서, 어떤 지점에서건 모든 부분이 비대칭적인 두 쪽, 끊긴 방향들, 닫힌 상자들, 통하지 않는 관들, 칸막이들로서 생산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여기서는 인접성조차도 거리이고, 거리는 긍정이며, 하나가 아닌 서로 다른 퍼즐들에서 온 퍼즐 조각들이 언제나 위치는 있지만 절대로 획정되지는 않은 곳에 서로 억지로 삽입되고, 서로 맞지 않는 그 가장자리들이 언제나 여분들과 더불어 서로 강요되고 타락하고 기와모양으로 뒤얽혀 있다. 이것은 탁월한 분열증적 작품이다. 죄책감이나 죄책감의 고백들 같은 것은 웃자고 있는 것이다(클라인의 용어로 말한다면,
집단 환상의 개념이 제도 분석의 관점에서 정교하게 구성되었을 때, 처음 과제는 그것과 개인 환상의 본성의 차이를 밝히는 것이었다. 집단 환상은 현실적인 것으로서의 사회장을 규정하는 <상징적> 분절들과 분리할 수 없는 반면, 개인 환상은 이 사회장 전체를 <상상적> 소여들로 몰아붙이는 것 같았다. 이 첫째 구별을 연장하면, 개인 환상 그 자체는 현존 사회장에 접목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회장을 상상적 성질들을 통해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상상적 성질들로 말미암아 사회장에는 일종의 초월성 내지 불멸성이 부여되고, 이것들을 빙자해 개인, 즉 자아는 자신의 사이비-운명을 누린다. 그래서 장군은 이렇게 말한다, 군은 영원하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은 대수롭지 않다고. 기존 사회질서에 부여된 불멸성은 자아 속에 탄압의 모든 투자, 동일시, 초자아화ㅡ 거세 등의 현상들, 모든 욕망-체념(장군이 되고, 하층 간부, 중간 간부, 상층 간부가 되겠다는 욕망의 체념)을 끌어넣고, 또 여기에는 사회질서를 위해 죽겠다는 체념도 포함되는데, 그런 한 개인 환상의 상상적 차원은 죽음 충동에 결정적 중요성을 지닌다. 반면 충동 자체는 바깥으로 투사되어 타인들을 겨냥한다(외국인에게 죽음을, 우리 편이 아닌 자들에게는 죽음을!). 이와 반대로 집단 환상의 혁명적 극이 나타나는 것은 제도들 자체란 죽기 마련이라고 체험하는 권력에서, 그리고 죽음 충동을 참된 제도적 창조성으로 만들면서 욕망과 사회장의 마디들을 따라 제도들을 파괴하거나 변화시키는 권력에서이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에 법이 기성 질서 안에서 제도들에게 전달하는 엄청난 관성과 혁명적 제도를 가르는, 적어도 형식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이다. 니체가 말한 것처럼 교회들, 군대들, 국가들, 이 모든 개 중에서 죽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서 집단 환상과 이른바 개인 환상 사이의 셋째 차이가 생겨난다. 이 차이는 개인 환상이 자아를 주체로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때의 자아는 그 속에서 자신이 <자신을 상상하는> 합법적이고 합법화된 제도들에 의해 규정된 한에서의 자아이다. 심지어 변태들, 속에서도, 자아는 법에 의해 강요된 분리들의 배타적 사용에 순응한다(가령 오이디푸스적 동성애). 하지만 집단 환상은 이제 충동들 자체, 그리고 이 충동들이 혁명적 제도와 더불어 형성하는 욕망 기계들만을 주체로 갖는다. 집단 환상은 분리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한가운데서 각 주체는 자신의 인물적 동일성은 제거되었으면서도 독자성들은 제거되지 않았으므로, 부분대상들의 고유한 소통을 따라 다른 주체와 관계를 맺게 된다. 각 주체는 기관 없는 몸 위에서 다른 주체의 몸으로 이행한다. 클로솝스키는 이 점에서 환상을 두 방향으로 찢어 갈라놓는 역전된 관계를 잘 보여 주었다. 이런 갈라짐은 경제법칙이 <심리적 교환들> 속에서 변태성을 설립하거나 이와 반대로 심리적 교환들이 경제법칙의 전복을 촉진하면서 생겨난다. <군집성의 제도적 층위에 대응해서, 시대착오적인 독자적 상태는 그 내공이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 제도 자체를 탈현행화할 수 있으며, 나아가 제도를 시대착오적이라고 고발한다.> 따라서 환상의 두 유형, 또는 차라리 환상의 두 체제는, <재화>의 사회적 생산이 하나의 자아를 매개로 자신의 규칙을 욕망에 부과하느냐, 아니면 정감들의 욕망적 생산이 자신의 규첵을 제도들에 부과하느냐에 따라 구별된다. 전자에 있어 자아의 허구적 통일은 재화 자체에 의해 보증되며, 후자에 있어 제도들의 요소들은 이제 단지 충동들일 따름이다. 푸리에 식으로 이 후자의 의미에서 아직도 유토피아를 말해야 한다면, 이는 물론 이상적 모델로서의 유토피아가 아니라 혁명적 능동과 수동으로서의 유토피아이다. 또한 클로솝스키는 최근 저서들에서 우리가 프로이트와 맑스 사이에서 벌이는 논쟁의 쓸모없는 병렬을 극복하는 유일한 수단을 제시해 준다. 즉 그는 사회적 생산과 생산관계들이 어떤 방식으로 욕망의 제도인지, 정감들 내지 충동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부구조 자체의 일부가 되고 있는지 발견하고 있다. 왜냐하면 정감들 내지 충동들은 경제적 형식들 속에서 자신의 탄압뿐 아니라 이 탄압을 부수는 수단들도 창조함으로써 하부구조의 일부가 되고 온갖 방식으로 거기에 현존해 있기 때문이다.
집단 환상과 개인 환상 사이의 구별들의 발전은, 결국 개인 환상이란 없다는 것을 충분히 드러낸다. 오히려 두 종류의 집단들이, 즉 주체 집단들과 예속 집단들이 있다. 오이디푸스와 거세는 상상적 구조를 형성하는데, 이 구조에서 예속 집단의 구성원들이 그 집단에 자기들이 속해 있음을 개인적으로 체험하거나 환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이 두 종류의 집단은 끊임없이 서로의 안으로 미끄러져 가고 있다고 말해야만 한다. 주체 집단은 언제나 예속될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예속 집단은 어떤 경우에는 억지로라도 혁명적 역할을 떠맡아야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프로이트의 분석이 환상에서 배타적 분리의 선들만을 얼마나 남겨 놓는지, 개인 내지 사이비-개인의 차원들 속에서 환상을 얼마나 부숴 버리는지를 보는 것은 참으로 마음이 불편한 일이다. 환상의 이 차원들은 그 본성상 환상을 예속 집단들에 관련시키며, 그와 반대되는 작업을 통해 환상 속에 깔려 있는 집단의 혁명적 잠재력의 요소를 뽑아내지 못한다. 교관, 선생이 아빠요, 대령도 엄마도 역시 아빠라고 배울 때, 그리하여 모든 사회적 생산과 반생산의 담당자들을 가족적 재생산의 형상들 위에 포갤 때, 우리는 불안에 빠진 리비도가 감히 오이디푸스를 떠나려 하지 못하고 오히려 오이디푸스를 내면화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리비도는 언표주체와 언표행위 주체를 거세하는 이원성의 형식으로 오이디푸스를 내면화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사이비-개인적 환상의 특성이다(<나는 인간으로서는 당신을 이해하지만 판사로서, 보호자로서, 대령이나 장군으로서는, 즉 아버지로서는 당신을 단죄한다>). 하지만 이 이원성은 인공적이고 파생된 것이요, 집단 환상 속에 있는 언표행위의 집단 담당자들과 언표의 직접적 관계를 전제하고 있다. p.118~121
삼각형은 부모적 사용에서 형성되고 혼인적 사용에서 재생산된다. 우리는 욕망의 등록에 간섭해서 욕망의 모든 생산적 연결을 변형하는 삼각형화를 ㅇ떤 힘들이 결정하는지 아직 모르고 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 힘들이 진행하는 방식을 대체적으로 따라갈 수 있다. 부분대상들은 시기상조인 총체성에 대한 직관 속에서 파악되며, 이와 마찬가지로 자아는 이 자아의 확립에 앞서는 통일성에 대한 직관에서 파악된다고 흔히들 말한다. 이러한 통일성-총체성이 부재의 어떤 양상에서만, 즉 부분대상들과 욕망의 주체들에 <결핍되어 있는> 것으로만 정립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모든 것은 이미 작동하고 있다. 초월적이며 공통적인 어떤 것을 외삽함으로써 성립하는 정신분석 조작은 도처에서 발견된다. 하지만 이 어떤 것이 보편적-공통적인 것은 오직 욕망에 결핍을 도입하기 위해서이다. 즉 이 보편적-공통적인 것의 부재라는 특정한 양상으로 인물들과 자아를 고정하고 특유화하고, 또 양성의 분리에 배타적 방향을 강요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일 뿐이다. p.134~136
사람들은 이탈될 수 있는 부분대상들에서 이탈된 완전한 대상으로 이행하는데, 이로부터 결핍의 배정을 통해 온전한 인물들이 등장한다. 가령 자본주의 코드와 그
삼위일체 공식에서는, 이탈될 수 있는 사슬로서의 돈이 이탈된 대상으로서의 자본으로 바뀌는데, 자본은 재고와 결핍이라는 물신적 양상을 띠고서만 존재한다. 오이디푸스의 코드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채취와 이탈의 에너지로서의 리비도는 이탈된 대상으로서의 남근으로 바뀌는데, 남근은 재고와 결핍이라는 초월적 형식으로만 존재한다(이 남근은 남성에게나 여성에게나 다 같이 결핍되어 있는 공통적이며 부재하는 어떤 것이다). 모든 성욕을 오이디푸스 틀 속에서 흔들거리게 하는 것인 바로 이 변환이다. 모든 흐름-절단을 똑같은 신화적 장소에 투사하는 것, 모든 비기표적 기호를 똑같은 주 기표로 투사하는 것 따위 말이다. <실효적인 삼각형화는 성욕을 어느 한 성으로 명시하는 것을 허용한다. 부분대상들은 그 유독성과 실효성에서 무엇도 상실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음경에 대한 지시는 거세에 그 충만한 의미를 부여한다. 이로 말미암아 부분대상들의 박탈, 사취, 결핍에 연결된 모든 외적 경험이 나중에 의미를 얻는다. 그전의 역사 전체는 거세의 빛에 따라 새 판본으로 개정된다.> p.136~137
게다가 거세와 오이디푸스화는 하나의 근본적 가상을 낳는다. 이 가상은 우리가 다음과 같은 것을 믿게 한다. 즉 현실적인 욕망적 생산은 바로 그것을 통합하고 그것을 초월적 법들에 종속시키고 그것을 우월한 사회적 문화적 생산에 기여하게 하는 더 높은 구성체들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말이다. 이렇게 되면 욕망의 생산과 관련하여 사회장의 일종의 <박리>가 나타나며, 그 박리에 근거해서 모든 체념이 미리 정당화된다. 그런데 정신분석은 치료의 가장 구체적 층위에서 전력을 다해 이 외견상의 운동을 뒷받침한다. 정신분석 자신이 무의식의 이 변환을 보증한다. 정신분석이 전-오이디푸스라고 부르는 것 속에서, 정신분석은 진화적 통합의 방향으로 (완전한 대상의 지배를 받는 우울증의 자리로) 넘어가거나 구조적 통합의 방향으로 (남근의 지배를 받는 전제군주 기표의 자리로) 조직되어야 하는 하나의 단계를 본다. 프로이트가 말한 갈등을 일으키는 소질, 즉 동성애와 이성애 사이의 질적 대립은 실은 오이디푸스의 한 귀결이다. 그것은 바깥에서 도은 치료의 장애물이기는커녕, 오이디푸스화의 한 산물이며 오이디푸스화를 다시 강화하는 치료의 한 역효과이다. 사실 문제는 오이디푸스를 여전히 축으로 삼고 있는 전-오이디푸스 단계들과 전혀 관련이 없다. 오히려 문제는 무오이디푸스적 성욕, 무오이디푸스적 이성애와 동성애, 무오이디푸스적 거세가 있는지, 있다면 그 본성은 무엇인지이다. 욕망적 생산의 흐름-절단들은 자신을 하나의 신화적 장소에 투사되게 하지 않으며, 욕망의 기호들은 자신을 하나의 기표 속에 외삽되게 하지 않으며, 횡단-성욕은 국지적, 비-특유한 이성애와 동성애 사이에 아무런 질적 대립도 생기게 하지 않는다. 이런 전환 속에는, 도처에, 변절의 죄책감 대신 꽃들의 결백이 있다. 그런데 정신분석의 이론과 실천은 무의식 전체를 욕망적 생산의 무오이디푸스적 형식과 내용으로 전환할 것을 보증하거나 보증하려 하는 대신, 무의식의 형식과 내용을 오이디푸스로 변환하려고 끊임없이 추진한다(실제로 우리는 정신분석이 오이디푸스를 <해결한다>라고 부르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신분석은 먼저 연결 종합들을 온전하고 특유한 사용으로 만듦으로써 이러한 변환을 추진한다. 이러한 사용은 초월적이라 규정될 수 있으며, 정신분석 작업 속의 첫째 오류추리를 함축한다.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칸트의 용어를 사용한다면 이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다. 칸트는 그가 비판적 혁명이라고 부른 것 속에서, 의식의 종합들의 정당한 사용과 부당한 사용을 구별하기 위해 인식의 내재적 기준들을 발견하고자 제안했다. 따라서 그는 형이상학에 나타나는 그런 종합들의 초월적 사용을 초월론적 철학(기준들의 내재성)이란 이름으로 고발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정신분석이 자신의 형이상학, 즉 오이디푸스를 갖고 있다고 말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하나의 혁명이, 이번에는 유물론적 혁명이 오이디푸스 비판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해야 한다. 이것은 오이디푸스적 정신분석에 나타나는 것과 같은 무의식의 종합들의 부당한 사용을 고발함으로써 진행되며, 이렇게 하는 것은 무의식의 기준들의 내재성에 의해 규정된 초월론적 무의식과 이에 대응하는 분열-분석으로서의 실천을 되찾기 위해서이다. p.138~139
그렇지만 분열증은 우리에게 오이디푸스 외적인 독자적 교훈을 주는 것 같으며, 분리 종합의 미지의 힘, 더 이상 배타적이지도 제한적이지도 않으며 오히려 충분히 긍정적, 무제한적, 포괄적인 하나의 내재적 사용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 같다. 여전히 분리되어 있으면서 도 분리된 항들을 긍정하고, 이 항들의 거리 전체를 가로질러 이 항들을 긍정하고, 한 항을 다른 항에 의해 제한하지도 않고 한 항을 다른 한 항으로 배제하지도 않는 분리, 이것은 아마 최고의 역설이다. <,,,,,,아니면> 대신 <,,,,,,이건,,,,,,이건.> 분열자는 남자이고 또한 여자인 것이 아니다. 그는 남자이거나 여자이지만, 정확하게 말하자면 두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남자들의 측면에서는 남자요, 여자들의 측면에서는 여자이다. 사랑스런 제이예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평행한 계열들을 길게 나열하고, 자신을 그 남녀 각각의 측면에 놓는다. 분열자는 죽었거나 아니면 살아 있는데, 동시에 두 상태에 있지는 않되, 이 두 상태 각각은 분열자가 미끄러지며 조망하는 거리의 양 끝에 있다. 그는 아이이거나 부모이거나이지, 아이이면서 뿌모이지는 않으며, 하지만 나눌 수 없는 공간에 있는 막대기의 두 끝처럼 한 쪽 끝ㅇ서 다른 것이 된다. 이와 같은 것이 베케트가 자기 작품의 인물들과 이 인물들이 겪는 사건들을 기입할 때 분리들의 의미이다. 즉 모든 것이 나뉘지만, 다만 자신 안에서 나뉜다. 분리들이 포괄적이 됨과 동시에, 거리들마저 긍정적이 된다. p.141~142
그는 모순되는 것들을 더 깊이 파 내려가 동일시함으로써 분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와 반대로 나눌 수 없는 거리를 조망함으로써 분리를 긍정한다. p.143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인간이라는 근원적 현실에 머무르면서 파생된 현실의 부정적 분리들을 넘어가는 종합이 아니라, 한 항에서 다른 항으로 표류하면서 거리에 따라 그 자체로 종합을 수행하는 포괄적 분리이다. 근원적인 것이란 없다. 이것은 저 유명한 대목과도 같다. <자정이다. 비가 창을 때린다. 자정이 아니었다. 비가 오고 있지 않았다.> 니진스키는 이렇게 적었다. 나는 신이고 나는 신이 아니었고 나는 신의 어릿광대이다. <나는 아피스요, 나는 이집트인이요, 붉은 피부 인디언이요, 흑인이요, 중국인이요, 일본인이요, 외국인이요, 미지의 사람이요, 바닷새요, 육지를 나는 새요, 톨스토이의 나무요, 그 뿌리이다.> <나는 남편이면서 아내요,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하며, 나는 내 남편을 사랑한다.....> 관건은 부모의 명칭도 인종의 명칭이나 신의 명칭도 아니다. 다만 이 명칭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중요하다. 의미가 문제가 아니라 오직 사용의 문제. 근원적인 것도 파생적인 것도 중요하지 않으며 일반화된 표류가 중요하다. 분열자는 있는 그대로의 무제한적인 계보학적 질료를 해방한다고 말할 수 있으리라. 여기서 그는 모든 분기점에 동시에, 모든 측면에 자신을 놓고, 자신을 기입하고, 자기 자리를 탐지할 수 있다. 그는 오이디푸스적 계보학을 취소한다. 점점 더 관계를 늘려 감으로써 그는 나눌 수 없는 거리들을 절대적으로 조망한다. p.143~144
오이디푸스는 우리에게 말한다. 만일 네가 아바-엄마-나를 분별하는 선들을 따라가지 않고, 또 선들을 따라 늘어선 배타적인 것들을 따라가지 않으면, 너는 미분화의 캄캄한 밤 속에 떨어지리라. 배타적 분리는 포괄적 분리와 전혀 같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자. [이 두 분리에서] 신은 동일하게 사용되지 않으며, 부모의 명칭들도 동일하게 사용되지 않는다. 부모의 명칭들은 이제는 내공 상태들(그렇다, 나는......이었다)이 아니라 온전한 인물들을 지시한다. 주체는 기관 없는 몸 위에서 이 내공 상태들을 지나가며 고아인 채로 있는 무의식 속에서 이 내공 상태들을 경험한다.
하지만 우리는 오이디푸스에 대해 이렇게 말해야만 한다. 그는 두 가지를, 즉 그가 정돈하는 분별들과 우리를 위협하는 미분화 둘 다를 창조하고 있다고 말이다. p.146
<아이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해결해야만 어른이 된다. 이 해결은 아이를 그가 처한 사회로, 권위의 모습 속으로 안내하고,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다시 살아야 한다는 의무속으로 안내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모든 출구가 막혀 있다. 문화 상태에 앞서는 것으로의 불가능한 회귀와 문화 상태가 야기하는 커 가는 불안감 사이에서, 평형이 발견될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오이디푸스는 미궁과 같다. 거기서 빠져나오면 반드시 그 속에 되들어간다. 문제로서의 오이디푸스 또는 해결로서의 오이디푸스는, 욕망적 생산 전체를 정지하면서 동여매는 끈의 양 끝이다. 암나사들은 단단히 죄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생산될 수 없고, 단지 소음만 들릴 뿐이다. 무의식은 부서지고 삼각형화되며, 자신이 하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된다. 모든 출구는 막혀 있다. 더 이상 분리들의 포괄적, 무제한적 사용이 가능하지 않다. 무의식에 부모가 생긴 것이다! p.147
요컨대 <이중 구속>은 오이디푸스의 집합과 다를 바 없다. 오이디푸스는 하나의 계열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 또는 신경증적 동일시와 이른바 규범적 내면화라는 두 극 사이에서 진동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이다. 이쪽이나 저쪽이나 모두 오이디푸스요, 이중의 막다른 골목이다. 여기서 분열자가 임상 존재로서 생산되는 것은 그것이 이 이중의 길을 벗어나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 길에서는 규범성도 신경증도 다 같이 출구가 없고, 문제도 해결도 다 같이 막혀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기관 없는 몸으로 퇴각한다. p.148
한족 끝에서 오이디푸스는 살해자와 동일시됨으로써 그 계열에 매이고, 다른 쪽 끝에서는 아버지의 권위를 회복하고 내면화함으로써 다시 그 계열에 매인다(<새 면 위에서 옛 질서의 재건>). 이 두 긑 사이에 잠복기, 저 유명한 잠복기가 있는데, 필경 이것은 정신분석의 가장 큰 기만이다. 여기서 말하는 잠복기는, 범죄의 결실들을 스스로 금하고 필요한 모든 시간을 내면화하는 데 보내는 <형제들>로 구성된 사회이다. 하지만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알게 된다. 이 형제들의 사회는 그야말로 음침하고 불안정하고 위험하며, 부모의 권위의 등가물을 재발견할 준비를 해야 하며, 우리를 다른 극으로 이행하게 해야 한다. 프로이트가 시사하는 바에 걸맞게, 미국 사회, 즉 경영의 익명성과 개인 권력의 소멸 등을 특징으로 하는 산업사회는 우리에게 <아버지 없는 사회>의 출현으로 제시되고 있다. 단, 이 사회는 부모의 등가물을 재건하기 위한 독창적인 양식들을 발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오이디푸스의 한 극을 떠나는 것은 단지 다른 극으로 옮겨 가기 위해서임이 분명하다. 신경증이건 규범성이건 오이디푸스에서 떠나가는 것은 아무 문제도 아니다. 형제들의 사회는 생산과 욕망 기계들에 관해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며, 반대로 잠복이라는 장막을 친다. 이렇게든 저렇게든 어떤 식으로든 오이디푸스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정신분석가가 정신병원에 처넣거나 경찰을 부른다. "경찰은 우리 편이야!"라는 말은, 정신분석이 사회적 탄압의 운동을 뒷받침하고 온 힘을 다해 그 운동에 참가하려 했음을 가장 잘 보여 주었다. p.149~150
이중 구속에 대한 분석의 최초의 깊은 사례는 맑스의 [유대인 문제]일 것이다. 가족과 국가 사이의, 가족의 권위인 오이디푸스와 사회의 권위인 오이디푸스 사이의 이중 구속이 거기서 깊이 분석되고 있다. 두 측면에서 무의식을 동여매는 것 말고는, 오이디푸스는 엄밀히 말해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다. p.150
분열-분석은 오이디푸스를 해결하겠다고 나서지 않으며, 오이디푸스적 정신분석보다 그것을 더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자부하지 않는다. 그것은 무의식을 탈-오이디푸스화해서 진정한 문제들에 도달하려 한다. 그것은 고아인 무의식의 저 지역들, 바로 <모든 법의 너머>에 도달하려 한다. 거기서는 그 문제가 제기될 수도 없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이 변화, 이 해방이 정신분석 바깥에서만 성취될 수 있다고 믿는 데서 성립하는 비관론에 가담할 수도 없다. 이와 반대로 우리는 정신분석 기계를 혁명 장치의 불가결한 부품으로 만드는 내적 역전의 가능성을 믿는다. 게다가 이 가능성의 객관적 조건들은 현실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 같다. p.151
참된 본성의 차이는 상징계와 상상계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인 것이라는 현실적 요소와, 상상계와 상징계로 이루어진 구조적 집합 사이에 있다. 여기서 전자는 욕망적 생산을 구성하며, 후자는 오직 신화와 그 변이형들만을 형성한다. p.153
이 질서는 무엇인가? 기관 없는 몸 위에 맨 먼저 할당되는 것은 인종들, 문화들, 신들이다. 분열자가 얼마만큼이나 역사를 만들었고 세계사를 환각하고 망상했으며 전 세계 인종들을 증식했는가 하는 점은 지금까지 충분히 주목되지 않았다. 모든 망상은 인종에 관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꼭 인종주의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기관 없는 몸의 지역들이 인종들과 문화들을 <재현한다>라는 말이 아니다. 충만한 몸은 숫제 아무것도 재현하지 않는다. 반대로 이 몸 위의 비역들, 즉 내공들의 지대들, 퍼텐셜들의 장들을 지시하는 것이 바로 인종들과 문화들이다. 이 장들 내부에서 개체화, 성 구별 등의 현상들이 생산된다. 한 장에서 다른 장으로 넘어가려면 문턱들을 넘어가야 한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주하고, 개체나 성을 바꾸기도 한다. 그리하여 떠남은 나고 죽는 일처럼 단순한 것이 된다. 인종들이 서로 싸우고 문명들을 파괴하는 일이 생긴다. 그 방식은 대이동 후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 풀포기 하나 나지 않는 것과 같다. 앞으로 보겠지만, 이 파괴들은 아주 다른 두 방식으로 행해지기는 하지만 말이다. 한 문턱을 넘어서면 다른 쪽에 대참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다른 식으로 할 수 있겠는가? 사람들이 살지 않게 된 곳들은 기관없는 몸이 다시 삼켜버린다. p.158~159
문제는 자신이 어떤 인물들과 동일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문제는 전혀 다른 어떤 것이다. 즉 인종들, 문화들, 신들을 기관없는 몸 위의 내공장들과 동일시하는 것이, 인물들을 이 장들을 채우고 있는 상태들, 즉 이 장들을 번개처럼 스치며 가로지르는 효과들과 동일시하는 것이 문제이다. 여기서 자신의 고유한 마술 속에서 행하는 이름들의 역할이 나온다. 재현의 무대 위에서 자신을 인종들, 민족들, 인물들과 동일시하는 하나의 자아는 없지만, 내공량들의 생산 속에서 인종들, 민족들, 인물들을 지역들, 문턱들ㅇ, 효과들과 동일시하는 고유명사들은 있다. 고유명사들의 이론은 재현의 견지에서 착상되어서는 안 되며, <효과들>의 부류에 관계된다. 효과들은 원인들에 단순히 의존하지 않고 한 영역을 채우며 기호 체계를 실효화한다. 물리학에서 고유명사는 퍼텐셜들의 장에서의 그러한 효과들을 지시한다. 역사에서도 물리학에서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 예컨대 잔 다르크 효과, 헬리오가발루스 효과 - 역사의 모든 이름은 그러하지만, 아버지의 이름은 그렇지 않다....... p.160
자크 베스의 놀라운 저서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분열자의 이중 산책을 발견한다. 즉 분해할 수 없는 거리들을 따라가는 외적인 지리적 여행과 이 거리들을 감싸고 있는 내공들을 따라가는 내적인 역사적 여행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춤추는 창녀를 모의하는 제독을 모의함으로써만 자기 배의 승무원의 반란을 진정하고 다시 제독이 될 수 있었다. 그런데 모의는 앞서 말한 동일시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것은 형식을 바구어야만 서로 나뉘는 내공들 속에 늘 감싸여 있는 분해할 수 없는 거리들을 표현한다. 동일시가 명명이요 지시라고 한다면, 모의는 이 명명에 대응하는 글, 심지어 현실계에서의 기이하게도 다의적인 글이다. 그것은 현실계를 그 원리에서 떼어 내어 현실계가 욕망 기계에 의해 실효적으로 생산되는 지점까지 데려간다. 이 지점에서 복사는 복사이기를 그치고 현실계 및 그것의 책략이 된다. 내공적 현실계를 그것이 자연과 역사의 공통 외연 속에서 생산되는 그대로 파악할 것, ..., 그리고 편집증적 고통과 독신의 영광 속에 있는 보물을 형성할 것. 역사상 모든 학살, 그것은 나다, 또한 모든 승리, 그것 또한 나다. 이는 마치 단순하고 일의적인 어떤 사건들이 이 극단적 다의성에서 뽑혀 나오기라도 한 것 같다. 클로솝스키의 공식을 따르면 이와 같은 것이 분열자의 <어릿광대짓>이며, 잔혹극의 진정한 프로그램, 현실계를 생산하는 기계의 연출이다. 분열자는 삶과의 뭔지 모를 어떤 접촉을 상실하기는 커녕, 오히려 현실의 고동치는 심장 가장 가까운 곳에, 현실계의 생산과 일체를 이루는 강렬한 지점에 있다. p.162
여기서 역사적-정치적, 인종적, 문화적인 것이 단순히 명시적 내용의 한 부분으로서 노작에 형식적으로 의존하는지, 아니면 반대로 가족 질서가 우리에게 감추고 잇는 잠복적인 것의 실마리로서 따라가야 하는 것인지 여부를 아는 것이 문제이다. 가족들과의 단절은 일종의 <가족 소설>, 즉 정확히 말해 여전히 우리를 가족들로 되돌려보내어, 가족 그 자체 안에서 하나의 사건 내지 구조적 규정을 조회하게 하는 <가족 소설>로 여겨져야 할까? 또는 이 단절은 문제가 전혀 달리 제기되어야 한다는 기호일까? 분열자는 자신을 가족 밖에 두고 있으니 말이다.
모든 것이 아버지로 복귀해서, 오이디푸스적 정신분석의 불충분함을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p.164~165
분열자는 오이디푸스를 결핍하고 있기 때문에, 오이디푸스 속의 어떤 것을 <결핍>하고 있기 때문에 병들고 현실에서 단절되었을까? 아니면 반대로, 그가 병든 것은 그가 견딜 수 없는, 그리고 모두가 덩달아 그에게 덮어씌우는 오이디푸스화 때문일까? p.167
자크 오슈망은 똑같은 <융합형 기본전제>를 갖고 정신병 가족의 몇몇 흥미로운 변이형들을 분석한다. 1. 고유한 의미의 융합형 가족 - 여기서는 오직 안과 밖(가족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만 구별이 존재한다. 2. 분파적 가족 - 이 가족은 자기 안에 블록들, 파벌들 또는 동맹들을 설립한다. 3. 관형 가족 - 여기서는 삼각형이 무한히 배가되며, 핵가족의 경계가 분간되지는 않지만 각 구성원은 타인들의 삼각형과 서로 맞물려 있는 자신의 삼각형을 갖고 있다. 4. 폐제형 가족 - 여기서 구별은, 제거되고 말살되고 폐제된 그 한 구성원에게 포함된 동시에 그로부터 쫓겨난 것으로서 존재한다.
가족이 소외와 탈소외의 고유한 권력들을 지니게 되는 외연을 가진 이 가족주의는, 정신분석 용어를 형식적으로 보존하고는 있으나 성욕에 관한 정신분석의 기본 입장들을 포기하게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p.172
<가족들은 사회 현실과 자기 아이들을 매개한다. 문제가 되는 사회 현실이 소외된 사회 형식들로 가득 차 있다 해도, 이 소외는 아이들 각각에게는 중재될 것이고 가족 관계에서의 이상한 일로 경험될 것이다. 가령 아이는 자기 정신이 전기기계나 외계인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구조물들은 대체로 가족의 과정이 구체화된 것들이며, 이 과정은 겉으로는 실체가 있는 현실처럼 보이지만, 정신병에 걸린 구성원의 정신을 글자 그대로 지배하는 가족 구성원들의 실천 행동의 소외된 형식이 아닌 다른 어떤 것도 아니다. 이 은유적 우주인들은 이른바 정신병 환자와 아침 식사의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글자 그대로의 어머니요 아버지요 형제자매 이다.> 반정신의학은 사회적 소외와 정신적 소외가 궁극적으로는 본성상 동일하다는 본질적 테제를 제기하는데, 이 테제마저도 가족주의의 거부가 아니라 가족주의의 유지와 관련해서 이해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소우주-가족, 사회지표-가족이 사회적 소외를 표현하는 한, 이 가족이 그 가족 구성원들 또는 정신병에 걸린 가족 구성원의 정신 속에 정신적 소외를 <조직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또 모든 구성원 중에 <누가 진짜 정신병자일까?>).
베르그손은 소우주-대우주 관계라는 일반적인 착상 속에 우리가 꼭 돌아봐야 할 하나의 신중한 혁명을 도입했다. 생물과 소우주를 비슷하다고 보는 일은 고대의 흔해 빠진 생각이다. 그런데 생물이 세계를 닮았다면, 그것은 본성적으로 닫힌 고립된 체계이거나 그런 체계를 향하기 때문이라고 흔히들 말해 왔다. 따라서 소우주와 대우주의 비교는 두 개의 닫힌 형상, 그중 하나가 다른 것을 표현하고 다른 것 속에 자신을 기입하는 두 형상의 비교였다. [창조적 진화]의 첫머리에서 베르그손은 이 둘을 모두 열어 놓음으로써 비교의 범위를 온통 바꾼다. 생물이 세계를 닮았다면, 이는 반대로 생물이 세계의 열림에 대해 자신을 여는 한에서이다. 또한 생물이 하나의 전체라면, 인는 전체가, 생물의 전체와 마찬가지로 세계의 전체가, 환원 불가능하며 닫혀 있지 않은 시간의 차원에서, 언제나 자신을 만들고 자기를 생산하거나 진보하고, 자신을 기입하는 한에서이다. 우리는 가족-사회의 관계도 이와 같다고 믿는다. 오이디푸스 삼각형이란 없다. 오이디푸스는 열린 사회장 안에서 늘 열려 있다. 오이디푸스는 사방으로, 사회장의 네 구석으로 열려 있다(3+1도 아니고 4+n). 잘못 닫힌 삼각형, 구멍 숭숭 물 새는 삼각형, 다른 곳으로 욕망의 흐름들이 빠져나가는 폭파된 삼각형. 사이비 삼각형의 꼭짓점들에서, 엄마가 선교사와 춤을 추고, 아빠가 세리에게 남색을 당하고, 내가 백인에게 매 맞는 것을 알아차리기 위해 식민지인들의 꿈은 기다려야만 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부모 형상들과 다른 본성을 지닌 담당자들의 이런 짝짓기, 이 둘의 씨름꾼처럼 얽힘, 바로 이것이 삼각형이 닫히고 그 자체로 타당해져서 무의식 그 자체 안에서 문제가 되는 이 담당자들을 표현 내지 재현하는 척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p.174~175
가족은 그 본성상 중심을 떠나 있고, 중심을 잃고 있다. 융합형, 분열형, 관형, 폐제형 가족에 관한 논의가 있다. 그런데 바로 가족을 하나의 <내부>이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절단들과 이것들의 분배는 어디서 올까? 아메리카에서 온 삼촌, 망나니가 된 형, 어떤 군인과 함께 떠난 숙모, 파산했거나 공황의 여파로 실직한 사촌 형, 무정부주의자인 할아버지, 미쳤거나 노망들어 입원한 할머니가 늘 있다. 가족은 이 절단들을 낳지는 않는다. 가족들은 가족적이지 않은 절단들에 의해 절단된다. 파리 코뮌, 드레퓌스사건, 종교와 무신론, 스페인내전, 파시즘의 대두, 스탈린주의, 베트남전쟁, 1968년 5월..... 이런 것들이 모두 무의식의 콤플렉스들을 형성하는데, 이것들은 늙어 빠진 오이디푸스보다 더 큰 영향들을 끼친다. 따라서 바로 무의식이 문제이다. 구조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정신 속에, 무의식의 결핍들, 이행들, 절합들을 분배하는 환상적인 남근의 보호 아래 있지 않다. 그것들은 불가능한 직접적 현실계 속에 실존한다. 곰브로비치가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구조주의자들은 <그들의 구조들을 문화 속에서 찾고 있지만, 나는 직접적 현실 속에서 찾는다. 내가 사물을 보는 방식은 당시의 사건들, 즉 히틀러주의, 스탈린주의, 파시즘..... 등과 직접 관계하는 것이다. 나는 인간들 사이의 영역에서 생겨 그때까지 존경받아 왔던 모든 것을 파괴한 기괴하고 무서운 형식들에 마음이 사로잡혔다.> p.178
가족주의의 주된 논변은 <적어도 처음에는 ......이다>라는 것이다. 이 논변은 명시적으로 정식화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발생의 관점을 거부하는 이론들 속에도 은연중에 존속하고 있다. 적어도 처음에는 무의식이 현실계, 상상계, 상징계가 뒤섞인 가족 관계들과 가족 성좌들 속에서 표현되리라는 것이다. 사회적, 형이상학적 관계들은 나중에, 마치 하나의 너머처럼 출현하리라는 것이다. 그런데 처음은 언제나 쌍으로 진행되기에(이것이 바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조건이다) 전-오이디푸스적인 첫 번째 처음, 즉 어머니와의 관계에서의 <인물의 가장 미숙한 단계들의 원초적 미분화>를 끌어대고, 그다음 두 번째 처음, 즉 아버지의 법을 지닌 오이디푸스 자신과 그 법이 가족 한가운데 처방하는 배타적 분별들을 끌어댄다. 끝으로 잠복기, 저 유명한 잠복기를 끌어대는데, 이것 다음에, 너머가 시작된다. 하지만 이 너머는 다른 사람들(도래할 아이들)에게 같은 길을 다시 걸어가게 하기 위한 것이기에, 또한 첫 번째 처음을 <전-오이디푸스>라 말하는 것은 이미 그것이 좌표축으로서의 오이디푸스에 속해 있음을 표시하기 위해서일 뿐이기에, 아주 분명한 것은 오이디푸스의 두 끝은 쉽게 닫혀 버렸다는 점, 너머나 나중은 오이디푸스와 관련해서, 오이디푸스와의 관계에서, 오이디푸스의 틀 안에서 늘 해석되리라는 점이다. 신경증자의 어린 시절 요인들과 현행 요인들의 역할을 비교하는 논의들이 증언하듯이, 모든 것은 오이디푸스로 복귀한다. <현행> 요인이 나중이라는 이런 형식으로 착상되는 한, 어떻게 사태가 달라질 수 있으랴? 하지만 진실로 우리는, 현행 요인들이 어린 시절부터 있고, 그것들이 가족 속에 도입하는 단절들 및 연결들과 관련하여 리비도 투자들을 규정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가족 식구들의 머리 위에는, 또는 아래에는 아이의 경험 속에서 그 본성의 동일함과 그 체제의 차이가 체험되는 욕망적 생산과 사회적 생산이 있다.
탄압적, 사회적 생산이 억압적 가족에 의해 대체되고, 도 후자가 억압된 것을 가족적 근친상간 충동들로 재현하는 이전된 이미지를 욕망적 생산에 주는 것은 동일한 운동 속에서이다. 그리하여 정신분석이 길을 잃는 교란 속에서, 가족과 충동들 간의 관계가 두 생산 간의 관계를 대신한다. 사회적 생산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조작의 이익은 분명해 보인다. 사회적 생산은 욕망이 갖고 잇는 반항과 혁명의 권력을 다른 식으로는 쫓아낼 수 없었으리라. 욕망에 근친상간이라는 일그러진 거울을 들이댐으로써(흥, 이게 네가 원했던 거지?) 욕망을 ㅂ끄러운 것으로 만들고, 욕망을 어안이 벙벙하게 하고, 욕망을 출구 없는 상황에 몰아넣으며, 문명이라는 보다 우월한 이해관계들의 이름으로 욕망이 <자기 자신>을 포기하도록 설득한다(그러니 만일 모든 사람이 그런 일을 한다면, 즉 모든 사람이 자기 어머니를 아내로 삼고, 또 자기 누이를 자기가 데리고 있으려 한다면, 어찌 될 것인가?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분별도 교환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재빠르게 곧바로 행동해야 한다. 근친상간은 별로 깊지도 않은 개울인데 중상모략을 당했구나. p.213
우리의 체계적 경향은, 상세한 목록 없이는, 현실의 명백한 죄악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세계의 무질서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소간 불가역적인 구조들 속에 기입된다 해도, 이 혼란이 어떤 점에서 주관적 혼란 속에 다시 나타나는가를 밝히지 않고서는 말이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이해하지만, 불온한 어조가 있음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다음의 선택을 강요받는 것이다. 즉 현행 요인이 온통 외적인 결핌의 방식으로 착상되거나(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아니면 현행 요인이 오이디푸스와 관계하는 필연적으로 내적인 질적 갈등에 잠겨 있거나......(오이디푸스, 그것은 정신분석가가 세계의 사악함들에서 손을 씻어 내는 원천이다). p.226
분열자가 어른이건 아이이건,분열자들과 현실적으로 영감을 받은 직접적 관계를 세울 줄 알았던 정신의학자와 정신분석가는 극히 드물었는데, 이들 가운데 지슬라 판코브와 브루노 베텔하임은 그 이론적 힘과 치료적 실효성을 통해 새로운 길들을 그리고 있다. 이 두 사람이 모두 퇴행 개념을 문제 삼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어떤 분열자에게 행한 몸 돌보기, 즉 마사지, 목욕, 짐질의 예를 들고서 지슬라 판코브는 묻는다. 간접적, 상징적 만족들은 환자에게 다시 전진할 수 있게 하고 전진하는 걸음을 회복시켜 주는데, 이런 만족들을 환자에게 주기 위해 환자의 퇴행 지점까지 도달하는 것이 중요한 일일까? 그래서 판코브는 말한다. <분열자가 아기 때 받지 못했던 돌보기를 해 주는 것>이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환자에게 자기 몸의 극한을 인정하게 해 주는 촉각적인 몸 감각들과 여타 감각들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 무의식적 욕망의 인정이 중요하지, 이 욕망의 만족이 중요한 게 아니다.>욕망을 인정한다는 것은, 뿐열자가 몸을 사려 욕망적 생산을 침묵시키고 질식시키는 바로 그곳, 즉 기관 없는 몸 위에서 욕망적 생산을 다시 작동하는 것, 바로 그것이다. 욕망의 이런 인정, 욕망의 이런 정립, 즉 이 '기호'는, 현실적이고 현행적인 생산성의 차원과 결부된다. 이 생산성은 간접적 내지 상징적 만족과는 전혀 무관하며, 또한 그것이 정지해 있을 때나 작동하고 있을 때나, 전-오이디푸스적 퇴행은 물론 오이디푸스의 전진적인 복원과도 구별된다. p.230~231
문학을 기성 질서에 순응하면서 아무에게도 해를 끼칠 수 없는 소비 대상으로 환원하는 데서도, 역시 오이디푸스화가 가장 중요한 요인들 중 하나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작가와 그 독자들의 개인적 오이디푸스화가 아니라, 사람들이 작품 자체를 지배적 사회 코드들을 따라 이데올로기를 분비하는 소소한 표현 활동이 되도록 복속시키려 시도하는 오이디푸스 형식이다. 그래서 예술 작품은 오이디푸스의 두 극, 즉 문제와 해결, 신경증과 승황, 욕망과 진실 사이에 기입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 하나는, 거기서 예술 작품이 어린 시절의 해결되지 않은 갈등들을 혼합하고 재분배하는 퇴행적 극이요, 다른 하나는 거기서 예술 작품이 인간의 장래에 관한 새로운 해결의 길들을 발명하는 전망적 극이다. 내면이 작품으로 전환되면 작품이 <문화 대상>으로 구성된다고들 말한다. 이런 관점에서는 정신분석을 더 이상 예술 작품에 적용한 여지조차 없다. 왜냐하면 예술 작품 자체가 성공한 정신분석을, 즉 모범적인 집단적 잠재성들을 지닌 숭고한 <전이>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위선적인 경고가 울려 퍼진다. 약간의 신경증은 예술 작품을 위해서 좋은 것이요, 좋은 재료지만, 정신병은, 무엇보다 정신병은 그렇지 않아. 우리는 결과적으로는 창조적인 신경증 양상과 소외시키며 파괴하는 정신병 양상을 구별하니까......p.237
<어떻게 이 벽을 가로질러야 할까. 강하게 두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으니. 이 벽을 파고 줄로 갈아 가로질러야 한다, 내 느낌에 천천히 참을성 있게.> 그리고 여기에 걸린 것은 예술이나 문학만이 아니다. 왜냐하면 예술 기계, 분석 기계, 혁명 기계는 억압-탄압 체계의 약해진 틀 속에서 이것들을 작동시키는 외래적 관계들 속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이것들이 단 하나의 욕망 기계를 배양하는 흐름 속에서 서로 부품이 되고 톱니바퀴가 되고 또 일방화된 폭발을 위해 참을성 있게 점화된 그 수만큼의 국지적인 불이 되거나, 이 둘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분열증이지, 기표가 아니다. p.242
어떤 점에서는, 자본주의는 모든 사회 형식에 출몰했으나, 섬뜩한 악몽으로, 즉 모든 사회 형식의 코드들을 벗어날 흐름에 대해 이 사회 형식들이 갖고 있는 공황 수준의 공포로 출몰했다. 다른 한편 세계사의 조건들과 가능성을 규정하는 것이 자본주의라면, 이는 본질적으로 자본주의 자신의 극한, 자본주의 자신의 파괴와 관련되는 한에서만 진실이다. 맑스의 말처럼 자본주의가 자기 자신을 비판할 수 있는 한에서만 말이다. 요컨대 세계사는 회고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발적이고 독자적이고 아이러니하고 비판적이다. p.246
니체는 <픙습의 도덕성, 즉 인류의 가장 오랜 시간에 걸쳐 인간이 자신에게 행한 고유한 작업, 인간의 선사 작업 전체>를 몸의 사지와 부분들에 관련해서 법의 힘이 있는 평가 체계라고 정의했다. 죄인은 집단 투자들의 질서에 따라 기관들을 박탈당하며, 먹혀야만 하는 자는 쇠고기를 자르고 할당하는 규칙들 만큼이나 엄밀한 사회규칙들에 따라 먹히지만, 그뿐 아니라 자기 권리들과 의무들을 십분 누리는 사람도 자신의 기관들과 이 기관들의 행사를 집단성과 관련시키는 체제에서는 온통 표시가 새겨진 몸을 갖는다. p.252~253
수직 구조의 시간적 연속성은 부계의 이름이 부계 친족에 전해짐으로써 적합하게 표현된다. 하지만 방계 구조의 연속성은 이런식으로 표현되지 않는다. 그 대신, 그것은 경제적인 종류의 부채 관계의 연속되는 사슬에 의해 유지된다.(.......) 결연 관계의 연속성을 확언하는 것은 바로 이 공공연한 부채들의 실존이다.> 혈연은 행정적이고 위계적이다. 하지만 결연은 정치적이고 경제적이다. 즉 결연은 위계와 혼동되지 않고 위계에서 연역되지 않는 한에서 권력을 표현하며, 또 행정과 혼동되지 않는 한에서 경제를 표현한다. 혈연과 결연은 원시 자본의 두 형식과도 같다. 말하자면 불변자본, 즉 혈연적 재고와, 순환 자본, 즉 이동 부채 블록들 말이다. 이것들에는 두 가지 기억이 대응하는데, 그 하나는 생물적, 혈연적 기억이요, 또 하나는 결연과 말들의 기억이다. 사회체 위의 혈연적 분리들의 그물 속에 생산이 등록된다 할지라도, 노동의 연결들은 생산과정에서 이탈되어야 하며, 준-원인으로서 이것들을 전유하는 이 등록 요소로 이행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런 일이 행해질 수 있는 것은 결연의 연줄이라는 형식으로, 즉 혈연의 분리들과 양립 가낭한 인물들의 혼인이라는 형식으로, 연결 체제를 자기 수중에 되찾을 때뿐이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경제는 결연을 통과한다. 아이들의 생산에 있어서, 아이는 아버지나 어머니라는 분리 가계들과 관련해서 기입되지만, 거꾸로 이 가계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에 의해 재현되는 연결을 매개로 해서만 아이를 기입한다. 따라서 그 어떤 때에도 결연이 혈연에서 파생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 둘 모두는 본질적으로 열린 순환을 구성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체는 생산에 작용하지만, 또한 생산은 사회체에 반작용한다. p.257
친족 체계는 하나의 구조가 아니라 하나의 실천, 하나의 프락시스, 하나의 절차, 심지어 하나의 전략이다. p.258
친족 체계가 닫힌 것처럼 보이는 것은, 친족 체계를 열린 채 유지하며 또 결연을 혼인 계급들 및 혈연 가계들의 배치와는 다른 것이 되게 하는 경제적, 정치적 준거들에서 친족 체계를 절단하는 한에서만 그럴 뿐이다. p.259
하지만 순수 유목민은 없다. 언제나 이미 야영지가 있어서, 여기서는 아무리 소량일지라도 비축하는 일이, 또 기입하고 할당하고 결혼하고 먹고사는 일이 문제이다(클라스트르는 구아야키족에서 어떻게 사냥꾼들과 살아 있는 짐승들 간의 연결이 야영지의 죽은 짐승들과 사냥꾼들 간의 분리로 바뀌는가를 잘 보여 준다. 이 분리는 근친상간 금지와 비슷한데, 왜냐하면 사냥꾼은 자기가 잡은 것을 소비할 수 없기 때문이다.)
흐름들은 재고의 최소치를 구성하는 이탈들의 대상이어야 하며, 기표 사슬은 매개의 최소치를 구성하는 이탈들의 대상이어야 한다. 하나의 흐름이 코드화되는 것은, 사슬에서의 이탈과 흐름에서의 채취가 조응해서 행해지고, 서로 합해지고 결혼하는 한에서이다. 그래서 원시 영토성 위에 결혼들을 가동하는 일은 이미 지역 집단들의 고도로 변태적인 활동이다. 그것은, 앙리 에이가 <선별과 정련과 계산이라는 정신 작업>이 드러나는 다른 경우들에 관해 말한 것처럼, 정상적인, 즉 비병리적인 변태이다. 그리고 사태는 처음부터 그러했다. 왜냐하면 흐름들을 타고 직접 혈연을 노래하는 데 그칠 수 있는 순수 유목민이란 없고, 이미 채취하고 이탈하면서 복귀하려고 기다리는 사회체가 늘 있기 때문이다. p.260
흐름에서의 채취들은 기표 사슬에서 혈연적 재고를 구성한다. 하지만 거쑤로 사슬에서의 이탈들은 결연의 이동 부채들을 구성하며, 이 부채들은 흐름들의 방향을 잡아 통제한다. 가족의 재고로서의 담요 위에서 사람들은 결연의 돌들, 즉 자패들을 순환시킨다. 이 순환에는 이를테면 큰 순환과 작은 순환이 있다. 큰 순환은 생산의 흐름들과 기입의 사슬들의 순환이요, 작은 순환은 흐름들을 사슬에 넣거나 처박는 혈연의 재고들과 사슬들을 흐르게 만드는 결연의 블록들 사이의 순환이다. 혈통은 생산의 흐름인 동시에 기입의 사슬이요, 혈연의 재고인 동시에 결연의 유동이다. 마치 이 재고가 기입 내지 등록 표면 에너지, 즉 외견상 운동의 퍼텐셜 에너지를 구성하는 듯 모든 일이 일어난다. 하지만 부채가 이 운동의 현행 방향이요, 이 표면 위에서 선물 주고 받기가 이동하는 각각의 길에 의해 규정되는 운동에너지이다. 쿨라에서, 목걸이와 팔찌의 순환은 특정 구역들과 특정 경우에 정지해서 다시 재고를 형성한다. 생산적 연결들을 전유하는 혈연의 분리들 없이는 생산적 연결들이 없지만, 인물들의 결연들 및 혼인들을 통한 방계연결들을 재구성하지 않는 혈연의 분리들도 없다. 흐름들과 사슬들뿐 아니라 고정된 재고들과 이동 블록들은, 제 나름 두 방향에서 사슬들과 흐름들의 관계들을 내포하는 한, 영속적인 상대성의 상태에 있다. 즉 그 요소들인 여자들, 소비재들, 제구들, 권리들, 위신들, 지위들이 변주되는 것이다. 어디에선가 일종의 가격 평형이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가정하면, 관계들의 명백한 비평형 속에서는 병리적 귀결을 보도록 강제된다. 이 병리적 귀결은, 급부가 더 넓고 복잡해지면서 닫혀 있다고 상정된 체계가 한 방향으로 확장되고 개방되는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설명된다. 하지만 이런 착상은 순 투자도 없고, 화폐와 시장도 없고, 상품 교환 관계도 없는 원시적인 <차가운 경제>와는 모순된다. 반대로 그런 경제의 원동력은 진정한 코드의 잉여가치에 있다. 사슬에서의 이탈 각각은 생산의 흐름들의 이쪽저쪽에서 초과와 부족, 결핍과 축적 등의 현상을 생산하는데, 이런 현상은 획득된 위신 내지 분배된 소비라는 유형의 교환 불가능한 요소들로 만회된다.(<족장은 화려한 축제를 매개로 소멸하는 가치를 소멸하지 않는 위신으로 전환한다. 이런 식으로 궁극적 소비나는 결국 최초 생산자이다.>) 코드의 잉여가치는, 그것이 모스의 다음과 같은 유명한 공식에 대응하는 한에서, 잉여가치의 원시적 형식이다. 즉 선물은 욕망과 권력의 영토적 기호요 재화와 풍요와 결실의 원리이므로 이자를 보태 갚아야 하는데, 바로 증여된 사물의 영, 즉 그 사물들의 힘이 이렇게 되게 만든다. 비평형은 병리적 귀결이기는커녕 기능적이며 근본적이다. 열림은 애초부터 닫힌 체계의 확장이기는 커녕 오히려 1차적이며, 급부를 구성하며 비평형의 이전을 통해 비평형을 만회하는 요소들의 이종성에 기초해 있다. 요컨대 결연의 관계들에 따른 기표 사슬에서의 이탈들은 흐름들의 층위에서 코드의 잉여가치를 낳으며 이로부터 혈연의 계열들을 위한 지위 차이가 나온다. 코드의 잉여가치는 원시 영토 기계의 잡다한 조작들을 실효화한다. 즉 사슬에서 절편들을 이탈시키기, 흐름에서 채취들을 조직하기, 각자에게 돌아오는 몫을 할당하기. p.261~263
그것은 고장나면서만 작동한다
원시사회들은 역사가 없으며 원형들 및 그 반복에 의해 지배당한다는 관념은 특히 허약하며 부적합하다. 이 관념은 민족학자들에게서 탄생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유대-그리스도교의 비극적 의식에 매여 있던 이데올로그들에게서 탄생했는데, 이들은 역사의 <발명>을 통해 이 비극적 의식을 뒷받침하려 했다. 기능적 비평형 상태 또는 요동치고 불안정하며 늘 만회되는 평형 상태 속에서, 제도화된 갈등들뿐 아니라 변화, 반항, 단적, 분열 들을 낳는 갈등들도 아우르는, 사회들의 역동적이고 열린 현실이 역사라고 불린다면, 원시사회들은 충만히 역사 속에 있으며, 만장일치 집단이 우위에 있다는 이유로 원시사회들에 돌리려 하는 안정 내지 심지어 조화와는 아주 거리가 멀다. 모든 사회 기계 속 역사의 현존은, 레비스트로스의 말처럼, <사건의 오인할 수 없는 표시가 발견되는> 부조화들에 잘 나타나 있다. p.263
하지만 여기서도 역시 정당한 해석은 무엇보다 현행적이고 기능적인 해석일 듯싶다. 즉 어떤 사회 기계가 잘 기능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기능하기 위해서이다. 이 점은 바로 절편적 체계와 관련해서 정확히 볼 수 있었는데, 이 체계는 언제나 자신의 폐허 위에서 자신을 재구성 할 만했다. 같은 점을 이 체계들에서 정치 기능의 조직에서도 볼 수 있는데, 정치조직은 자신의 무력함을 내보임으로써만 실효적으로 실행된다. 민족학자들은 친족 관계의 규칙들이 현실의 결혼에서는 적용되지도 않고 또 적용될 수 없다고 끊임없이 말한다. 이 규칙들이 이상적이라서가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 규칙들이, 봉쇄된다는 조건에서 배치가 다시 작동을 시작하며 또 배치가 집단과 필연적으로 부정적 관계에 놓이는 임계점들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서 사회 기계와 욕망 기계의 동일성이 나타난다. 사회 기계의 극한은 마모가 아니라 고장이며, 사회 기계는 삐걱거리고 고장 나고 작은 폭발들을 터뜨리면서만 기능한다. 기능 장애들은 그 기능 자체의 일부를 이루는데, 이는 잔혹 체계의 미미한 양상이 결코 아니다. 부조화나 기능 장애가 사회 기계의 죽음을 알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와 반대로 사회 기계는 자기가 유발하는 모순들, 자기가 초래하는 위기들, 자기가 낳는 불안들, 그리고 자신에게 새로운 힘을 주는 지독한 조작들을 먹고사는 습관이 있다. 자본주의는 이것을 깨달았고, 자기 의심을 멈췄으며, 한편 사회주의자들도 마모에 의한 자본주의의 자연사 가능성을 믿기를 포기했다. 그 누구도 모순으로 인해 죽은 적은 없다. 그리고 그것이 고장 날수록, 그것이 분열증화할수록, 그것은 더 잘 작동한다. 미국식으로 말이다.p. 263~265
혈연의 양도 불가능성과 결연의 이동성 사이에는, 절편들의 가변성과 상대성에서 유래하는 온갖 종류의 상호 침투가 있다. 각 절편은 정돈된 등급들의 계열 속에서 서로 다른 절편들과 대립함으로써만 자신의 길이를 측정하며, 또한 그런절편으로 실존하기 때문이다. 절편 기계는 혈연의 변주와 결연의 유동을 가로질러 경쟁들, 갈등들, 단절들을 뒤섞는다. 체계 전체는 두 극 사이에서 진화한다. 한 극은 다른 집단들과 대립하는 융합의 극이요, 다른 극은 결연들과 혈연을 자본화함으로써 독립을 열망하는 새 가문을 부단히 형성하는 분열의 극이다. 한 극에서 다른 극에 걸쳐, 자신의 부조화들에서 끊임없이 다시 태어나는 체계 안에서 온갖 실패와 온갖 궁지가 생산된다.....사회구성체들은 자기 체계의 기능의 필수 부분을 이루는 저 기능 장애들을 대가로 바깥에서 도달하는 것의 내부 잠재력을 질식시킨다. p.265~266
역사 밖에 있는 것은 원시사회들이 아니다. 바로 자본주의가 역사의 끝에 잇는 것이다. 바로 자본주의가 우발들과 우연들의 오랜 역사에서 귀결되는 것이며, 역사의 끝을 도래하게 한다. 예전의 구성체들이 이를, 즉 안에서 올라오기에 올라오는 것을 애써 막아 바깥에서 왔을 뿐인 이 자를 예견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로부터 역사 전체를 자본주의와 관련해서 회고적으로 읽을 가능성이 나온다. 전-자본주의사회들에서 계급의 기호를 찾아보는 일은 이미 가능하다. 하지만 민족학자들은 이 원-계급들, 즉 제국 기계에 의해 조직된 카스트들과 원시 절편 기계에 의해 분배된 신분들을 할당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지적하고 있다. 계급, 카스트, 신분을 구별하는 기준들은 고정성이나 침투성, 상대적 폐쇄성 내지 개방성 등의 측면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 이런 기준들은 매번 믿을 수 없고 특히나 기만적임이 들통 난다. 하지만 신분은 원시 영토 기계와 뗄 수 없는데, 이는 마치 카스트가 제국의 국가적 초코드화와 뗄 수 없는 것과 같다. 반면 계급은 자본주의 조건들 속에서 탈코드화된 상공업 생산과정과 상대적이다. 따라서 계급의 기호 아래서 전체 역사를 읽을 수는 있으나, 이것은 맑스가 제시한 규칙들을 지킴으로써, 또 계급이 카스트와 신분의 <음화>인 한에서만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확실히 탈코드화 체제는 조직화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음침한 조직, 가장 경직된 회계를, 즉 언제나 대립 추론에 의해, 코드들을 대체하고 코드들을 포함하는 공리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p.267~268
결코 결연은 혈연에서 파생되지도 않고 연역되지도 않는다. 하지만 이 원리가 정립되면 우리는 두 관점을 구별해야 한다. 하나는 경제적, 정치적 관점으로, 이에 따르면 결연은 외연을 지닌 채 주어졌다고 상정되는 체계 속에 미리 실존하지 않는 확장된 혈연 가계들과 함께 조합되고 직조되면서 늘 있다.....왜냐하면 게보들과 혈연들이 늘 깨어 있는 기억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미 이것들이 결연들이 특정 의미를 지녔다고 규정되기 전에는 분명코 소유하고 있지 않았던 외연상의 의미로 파악되는 한에서이다. 이와 반대로, 계보와 혈연들은 내공적 혈연들로서, 밤의 기억이요 생물적-우주적 기억인 특별한 기억의 대상이 되며, 이 기억은 확장된 새 기억이 설립되기 위해 정확히 말해 억압을 겪어야만 한다. p.272
왜 문제가 결코 혈연에서 결연으로 가는 데 있지 않은지, 즉 후자를 전자에서 끌어내는 데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에너지와 내공의 차원에서 외연의 체계로 이행하는 데 있는데, 후자는 질적 결연들과 확장 혈연들을 동시에 포함한다. 내공 차원의 최초의 에너지, 즉 누멘이 혈연의 에너지라는 점은 사태를 조금도 바꾸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강렬한 혈연은 아직 확장되지 않았고, 아직 인물들 및 심지어 성의 구별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내공을 지닌 전-인물적 변주들만을 포함하고 있고, 그러면서 잡다한 등급에서 취한, 같은 쌍둥이 내지 양성성을 변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차원의 기호들은 (라이프니츠가 플러스(+)일 수도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 기호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한 표현을 따르면) 근본적으로 중립이거나 중의적이다. 문제는 어떻게 이 최초의 내공에서 출발해 다음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외연 체계로 이행하는지를 아는 일이다. 1. 혈연들이 가문들의 형식으로 확장 혈연들이 되어, 인물들의 구별들과 부모의 명칭들을 포함하는 일. 2. 결연들은 동시에 질적 관계들이 되는데, 이 관계들이 확장 혈연들을 전제하는 만큼이나 이 혈연들이 또한 이 관계들을 전제하는 일. 3. 요컨대 중의적인 강렬한 기호들이 중의적이기를 그치고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되는 일. 레비스트로스가 결혼의 단순한 형식을 위해 평행 사촌의 결혼 금지와 교차 사촌의 결혼 승인을 설명하는 여러 구절에 걸쳐 이 점은 분명히 나타난다. 두 가문 A와 B사이의 결혼마다, 이 부부가 A나 B에게 획득에서 결과하느냐 상실에서 결과하느냐에 따라 <+> 또는 < -> 기호의 절단이 부여된다. 이 점에 관해 혈연의 체제가 부계인가 모계인가는 거의 중요하지 않다.
어머니와 누이는 이들을 배우자로 금지하기 전에는 실존하지 않는다. 로베르 졸랭은 이를 아주 잘 말하고 있다. <신화적 담론은 근친상간에 대한 무관심에서 근친상간 금지로의 이행을 주제로 삼고 있다. 암묵적으로건 명시적으로건, 이 주제는 모든 신화의 밑바닥에 깔려 있다. 따라서 이 주제는 신화적 언어활동의 공식 특성이다.> 근친상간에 관해, 그것은 문자 그대로 실존하지 않으며 실존할 수도 없다고 결론지어야 한다.......근친상간은, 언제나 우리를 근친상간에서 멀어지게 하는 일련의 대체물들을 따라서만 할 수 잇다. 말하자면, 어머니나 누이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만 어머니나 누이의 등가물인 인물과만, 즉 가능한 배우자로서 분간된 여자와만 근친상간을 할 수 있다.......<사람들은 신화 속의 근친상간 관계들을 고려할 때, 그런 관계들이 가능하거나 그런 관계들에 무관심한 세계에 대한 욕망 내지 향수의 표현으로 여기거나, 또는 사회 규칙을 역전시키는 구조적 기능, 즉 금지와 그 위반을 정초하도록 예정된 기능의 표현으로 여긴다.(.......) 둘 중 어떤 경우건, 사람들은 신화가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질서의 출현, 바로 그것을 이미 구성된 것으로 받아들인다. 바꾸어 말하면, 사람들은 마치 신화가 아버지, 어머니, 아들, 누이로 정의된 인물들을 등장시키고 있는 양 추론한다. 그런데 이 친족 역할들은 금지에 의해 구성된 질서에 속한다. (........) 근친상간은 실존하지 않는다.> 근친상간은 하나의 순수한 극한이다. 단, 극한에 대한 두 가지 거짓 믿음을 피한다는 조건에서 말이다. 하나는, 마치 금지가 어떤 것이 <우선> 그런 어떤 것으로 욕망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라도 하는 양, 극한을 모태 내지 기원으로 만드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욕망과 법 사이의 <근본적>이라고 상정된 관계가 위반에서 시행되기라도 하는 양, 극한을 구조적 기능으로 만드는 것이다. 한 번 더 상기해야 할 것이 두 가지 있다. 첫째, 법은 욕망의 기원적 현실에 대해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는다는 점. 왜냐하면 법은 욕망된 것을 본질적으로 왜곡하기 때문이다. 둘째, 위반은 법의 기능적 현실에 대해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는다는 점. 왜냐하면 위반은 법에 대한 비웃음이기는커녕, 그 자체가 법이 현실적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한 비웃음이기 때문이다(바로 이런 까닭에 혁명은 위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요컨대 극한은 이쪽도 너머도 아니다. 그것은 이 둘의 극한이다. 근친상간, 그다지 깊지 않은 개울인데 중상을 받누나. 언제나 이미 건넜거나, 아직 건너지 않은 개울. 왜냐하면 근친상간은 운동과 같아서,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근친상간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현실계가 불가능하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반대로 상징계가 불가능하다는 의미에서이다. p.280~281
금지에서 금지된 것의 본성을 결론으로 끌어내는 것이 얼나ㅁ나 부당한가를 우리는 상기한다.왜 냐하면 금지는 죄가 있는 자를 불명예스럽게 하면서, 즉 현실적으로 금지 내지 욕망되는 것의 왜곡되거나 이전된 이미지를 도입하면서 진행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식으로 탄압은 억압을 통해 자신을 연장하는데, 이런 억압이 없었다면 탄압은 욕망에 침범하지 못했을 것이다. p.282
하지만 바로 다음과 같은 두 근친상간을 혼동할 수는 없다. 즉 근친상간을 제정하는 비인물적 내공체제 속에 있는 그런 근친상간과, 근친상간을 금하고 근친상간을 인물들에 대한 위반으로 규정하는 상태에서 외연 속에서 재현되는 그런 근친상간을 혼동하면 안 된다. 따라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그것 자체와는 전혀 다른 것을 의미하며, 또한 어머니는 거기서 토지이기도 하고, 근친상간은 무한한 재생이라고 말할 때 융은 전적으로 옳다. p.283
하지만 임플렉스, 즉 배아 내류는 욕망의 영토적 대표인데, 왜 이것이 억압될까? 그 까닭은...... 대표의 자격으로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코드화할 수도 없고 코드화를 허락하지도 않는 흐름, 바로 원시 사회체의 공포이기 때문이다. 그 어떤 사슬도 이탈될 수 없을 테고, 그 무엇도 채취될 수 없으리라. 그 무엇도 혈연에서 자손으로 이행하지 않을테고, 도리어 자손이 자신을 다시 낳는 행위 속에서 영속적으로 혈연으로 귀착하리라. 기표 사슬은 아무런 코드도 형성하지 않을 테고, 다만 중의적인 기호들만을 발신할 것이며, 또 자신의 에너지의 뒷받침에 의해 영속적으로 부식되리라. 토지의 충만한 몸 위를 흘러가는 것은, 기관 없는 몸의 사막 위를 미끄러져 가는 코드화되지 않은 흐름들만큼이나 사슬에서 풀려나리라...... 흐름들이 코드화할 수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들의 에너지가 양화되고 또 질화되어야 하며, 어떤 것은 이행해야 하지만, 또한 어떤 것은 봉쇄되어야 하며, 또 어떤 것은 저지하거나 이행시켜야 한다. 그런데 이런 일은, 인물들을 분간할 수 있게 하는, 또 기호들을 규정된 방식으로 사용하고, 분리 종합들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연결 종합들을 혼인적으로 사용하는, 외연을 지닌 체계에서만 가능할 뿐이다. p.284
이행하는 것은, 봉쇄된 것의 만회로서 진정한 코드의 잉여가치를 이끌어낸다. 이 잉여가치는 외삼촌이 이행하게 하는 한에서 외삼촌에게 돌아온다. 반면 외삼촌은 그가 봉쇄하는 한에서 일종의 <감가>를 당한다.(이렇게 해서 외삼촌 집에서 의례적인 도둑질이 조카들에 의해 행해지지마느 또한 그리올의 말처럼, 가장 나이 많은 조카가 외삼촌 집에서 살게 될 때는 외삼촌의 재산이 <늘어나고 결실을 맺게> 된다). p.285
하지만 다음 두 가지는 진실이다. 곧 식민지인은 오이디푸스화에 저항한다는 것, 그리고 오이디푸스화는 식민지인 위에서 닫히려 한다는 것. 오이디푸스화가 있는 한, 그것은 식민화의 사실이며, 졸랭이 [백색 평화]에서 잘 묘사한 모든 절차를 거기에 덧붙여야만 한다. <식민지인의 상태는 우주의 인간화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서, 거기서 추구되는 해결 전체는 개인 내지 가족 수준에 제한되며, 그 결과 집단 차원에서는 극단의 무정부상태 내지 무질서가 생긴다. 개인은 언제나 이 무정부상태에 희생되는데, 예외가 있다면 그러한 체계의 열쇠에 해당되는 사람들, 즉 이 경우 식민지배자들이다. 이들은 식민지인이 우주를 축소하는 것과 바로 동시에 자신의 우주를 확대하는 쪽으로 향한다.> 오이디푸스는 민족말살에서의 안락사 같은 것이다. 사회적 재생산이 그 본성과 외연에서 집단 구성원들을 빠져나가면 나갈수록, 사회적 재생산은 이 구성원들을 덮쳐, 이 구성원들 자신을 오이디푸스를 담당자로 하는 제한되고 신경증화된 가족적 재생산으로 내몬다. p.295
따라서 문화주의를 잘못된 길로 돌아서게 한 것은 무엇일까? 그런데 여기서도 처음에 잘 출발했다는 것과 처음부터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는 것 사이에는 모순이 없다. 아마도 오이디푸스 상대주의와 오이디푸스 절대주의에 공통되는 기본전제, 말하자면 모든 곳을 황폐하게 만드는 가족주의 관점에 대한 완고한 옹호가 그 답이리라. 왜냐하면 만일 제도가 우선 가족제도로 이해된다면, 가족 콤플렉스가 제도들과 함께 변주된다고 말하건, 반대로 오이디푸스는 가족들과 제도들이 주위를 도는 핵심 불변항이라고 말하건, 거의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화주의자들은 다른 삼각형들, 가령 외삼촌-숙모-조카라는 삼각형을 원용한다. 하지만 오이디푸스주의자들은 이런 삼각형들이 하나의 동일한 구조적 불변항을 위한 상상적 변주들이며 하나의 동일한 상징적 삼각형화의 상이한 형상들이라는 것을, 또한 이 형상들은 이 삼각형화를 실효화하게 되는 등장인물들과 혼동되지 않고, 또 이 등장인물들을 서로 관계시키는 태도들과도 혼동되지 않는다는 점을 힘들이지 않고 보여 준다.p.302
왜냐하면 만일 제도가 우선 가족제도로 이해된다면, 가족 콤플렉스가 제도들과 함께 변주된다고 말하건, 반대로 오이디푸스는 가족들과 제도들이 주위를 도는 핵심 불변항이라고 말하건, 거의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화주의자들은 다른 삼각형들, 가령 외삼촌-숙모-조카라는 삼각형을 원용한다. 하지만 오이디푸스주의자들은 이런 삼각형들이 하나의 동일한 구조적 불변항을 위한 상상적 변주들이며 하나의 동일한 상징적 삼각형화의 상이한 형상들이라는 것을, 또한 이 형상들은 이 삼각형화를 실효화하게 되는 등장인물들과 혼동되지 않고, 또 이 등장인물들을 서로 관계시키는 태도들과도 혼동되지 않는다는 점을 힘들이지 않고 보여 준다. p.302
즉 극한을 사회치 내부로, 중간으로, 결연의 저쪽과 혈연의 이쪽 사이로, 결연의 재현과 혈연의 대표 사이로 옮기는 임무가. 이는 마치 강에 인공 하상을 파거나 그다지 깊지 않은 수많은 개울에 물줄기를 돌리거나 하여 그 강의 두려운 힘들을 쫓아내는 일과도 같다. 오이디푸스는 이전된 극한이다. 그렇다, 오이디푸스는 보편적이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양자택일을 믿어 버리는 것은 잘못이다. 오이디푸스는 억압-탄압 체계의 산물이고, 그러면 오이디푸스는 보편적이지 않다. 그게 아니면, 오이디푸스는 보편적이며 욕망의 정립이다. 실상 오이디푸스가 보편적인 것은 그가 모든 사회에 출몰하는 극한의 이전이기 때문이며, 모든 사회가 자신의 가장 깊은 음화로서, 즉 욕망의 탈코드화된 흐름들로서 절대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을 왜곡하는 이전된 재현내용이기 때문이다.
오이디푸스가 점유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불가결하다. 1. 사회적 생산과 재생산의 장이, 가족 재생산, 말하자면 결연들과 혈연들을 직조하는 영토 기계와 별도로 만들어져야 한다. 2. 리 독립성을 이용하여, 사슬에서 이탈할 수 있는 파편들은 이 파편들의 다성성을 으깨는 어떤 이탈된 초월적 대상으로 수렴되어야 한다. 3. 이탈된 대상은 일종의 접기나 적용 또는 복귀 -출발 집합으로 정의된 사회장을 이제는 도달 집합으로 정의된 가족장으로 복귀시키기- 를 조작하여, 양자 간의 일대일대응 관계들의 그물을 설립해야 한다. 오이디푸스가 점유되기 위해서는, 그가 재현 체계 속의 극한 또는 이전된 재현내용이어서는 충분치 않다. 그는 이 체계의 한가운데로 이주하고 그 자신이 욕망의 대표 자리를 점유하게 되어야 한다. 무의식의 오류추리들과 뗄 수 없는 이 조건들은 자본주의 구성체 속에서 실현된다. 이 조건들이 야만적인 제국 구성체들에서 받은 어떤 의고주의들, 특히 초월적 대상의 정립을 여전히 내포하고 있지만 말이다. 자본주의 스타일은 로런스에 의해 잘 묘사되었다. <우리 민주적, 산업적 사태의 질서, 귀엽고-작은-내-새끼 양-보고-싶은-엄마(my-dear-little-lamb-I-want-to-see-mommy)라는 스타일.>
왜냐하면 영국인이 아니라는 것이야말로 미국인이 되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미국 작가의 교육에서 첫걸음은 그토록 오랫동안 죽은 영국 장군들의 지휘 아래 행군해 온 영국 단어들의 전 부대를 물리치는 것이다. 그는 <작은 미국 단어들>을 길들여 자기 명령에 따르게 해야 한다. 그는 필딩과 새커리의 학교에서 배운 것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시카고 술집의 사람들에게, 인디애나의 공장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쓰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것이 첫걸음이다. 하지만 다음 걸음은 훨씬 더 어렵다. 자신이 무엇이 아닌지 결정한 다음에는 자신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극과 극으로 다른 작가들 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날카로운 자의식의 단계가 시작된다. 정말이지 어떤 것도 이 자의식과 그에 따르는 신랄함, 주로 영국에 대한 신랄함의 만연 이상으로 영국 작가들을 놀라게 하지는 않는다. 최근까지도 매여 있던 속박의 기억에 시달리는 다른 종족의 태도가 끊임없이 환기된다. 여성 작가들도 미국인들을 에워싸고 있는 동일한 문제 중 많은 것을 만나야만 한다. 그녀들도 여성으로서의 특수한 입장을 의식하여, 무례함을 예민하게 알아차리며, 억울함을 되갚기에 민첩하고, 자신들 고유의 예술을 창달하기에 열심이다. 두 경우에 모두 그들과 작품 사이에 예술과 무관한 온갖 종류의 의식 -자신과 인종과 성과 문명에 대한 의식- 이 끼어든다. 그 결과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불행한 결과가 빚어진다. 가령 앤더슨 씨가 자신이 미국인이라는 사실을 잊을 수 있었다면 훨씬 더 완벽한 작가가 되었으리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오래된 말이든 새로운 말이든, 영국 말이든 미국 말이든, 고전어든 비속어든 모든 말을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면 그는 훨씬 더 훌륭한 산문을 썼을 것이다. 버지니아 울프, 어느 보통 독자의 책 읽기, p.101~102
라드너 씨의 가장 잘된 작품들이 운동 경기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다. 그는 스포츠에 대한 관심으로 미국 작가의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를 풀었으니 말이다. 그것은 그에게 광대한 대륙이 고립시키는, 어떤 전통으로도 다스려지지 않는 사람들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열쇠를, 핵심을, 구심점을 주었다. 영국 작가에게 사회가 준 것을, 그는 스포츠에서 얻었다.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라드너 씨는 무엇인가 독특한 것, 토착적인 것을, 여행자가 자신이 정말로 미국에 갔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기념품으로 가져갈 만한 것을 만들어 냈다.p.111
우리는 이미 덜컹거리는 소리, 귀에 거슬리는 소리, 목이 졸린 듯 까다로운 음악을 그 전주곡으로 듣고 있다. 책을 덮고 영국의 들판을 내다보노라면, 귓전에 새된 소리가 들려온다. 3백 년 전에 그 부모가 바위투성이 해안에 버린, 그래서 자신의 노력만으로 살아남은 아이의 첫 정사, 첫 웃음의 소리이다. 그는 다소 생채기가 났지만 자존심이 강하며 따라서 소심하고 자기주장이 강하다. 그는 이제 성년의 문턱에 서 있다. p.115~116
언제나 분명하게 정식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민족학자들과 희랍연구가들은, 상징은 그것이 의미하는 바에 의해 정의되지 않고 그것이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으로 무엇을 하는지에 의해 정의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언제나 남근 내지 이와 비슷한 어떤 것을 의미한다. 단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그것이 무엇에 소용되는가를 말하지 않을 뿐이다. 요컨대 민족지 자료가 없다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민족학적 해석이 없는 것이다. 오직 사용들과 기능들만이 있다. 이 점에 관해 민족학자들이 정신분석가들에게서 많이 배운다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즉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많이 배울 수 있는 것이다. 희랍 연구가들이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에 반대할 때, 그들이 정신분석적 해석에 다른 해석들을 대립시키고 있다고 믿는 일은 피해야 하리라. 민족학자들과 희랍 연구가들은 결국 자신들을 위해 정신분석가들이 억지로 자신들과 비슷한 발견을 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더 이상 무의식적 재료도 없고 정신분석적 해석도 없으며, 다만 사용들, 즉 무의식의 종합들의 분석적 사용들만 있는데, 이 사용들은 기표의 배정이나 기의들의 규정을 통해서 더 이상 정의되지 않는다는 발견이다.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가가 유일한 물음이다. 분열-분석은 일체의 해석을 포기한다. 왜냐하면 분열-분석은 무의식적 재료를 발견하는 일을 일부러 포기하기 때문이다. 무의식은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다. 반대로, 무의식은 기계들을 만드는데, 이 기계들은 욕망의 기계들이요, 분열-분석은 사회 기계들의 내재성 속에서 이 기계들의 사용과 기능을 발견한다. 무의식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다만 기계 작동한다. 그것은 표현적 내지 재현적이지 않고 다만 생산적이다. 상징은 오직 욕망 기계로서 기능하는 하나의 사회 기계요 사회 기계 속에서 기능하는 욕망 기계이며, 욕망에 의한 사회 기계의 투자이다.
그램분자적인 것과 분자적인 것
제도는 기관과 마찬가지로 그것의 사용에 의해 설명될 수 없다고 종종 이야기되고 증명되었다. 생물 구성체, 사회구성체는 이것들이 기능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 또한 특유한 거대 집합들의 층위에도 생물학적, 사회학적, 언어학적 등의 기능주의는 없다. 또한 특유한 거대 집합들의 층위에도 생물학적, 사회학적, 언어학적 등의 기능주의는 없다. 하지만 분자적 요소들로서의 욕망 기계들에서는 사정이 같지 않다. 거기서는 사용, 기능, 생산, 형성이 하나일 따름이다. 바로 욕망의 이 종합이, 어떤 규정된 조건들 아래서, 그램분자 집합들 및 생물학장, 사회장 또는 언어학장에서 이것들의 특유한 사용을 설명해준다. 이는 거대 그램분자 기계들의 기능이 설명해 주지 못하는 미리 설립된 연계들을 이 기계들이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전자의 기능이 이 연계들을 설명하지 못하는 까닭은, 전자가 후자에서 비로소 나오기 때문이다. 오직 욕망 기계들만이 자신을 기능하게 해 주는 연계들을 생산하는데, 여기서 이런 기능은 이 연계들을 임시변통으로 만들어 내고, 발명하고 형성하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그램분자적 기능주의는, 욕망이 기계 작동하는 것의 거시적 본성에서 독립해, 즉 같은 냄비에서 모두 함께 요리되기 위해 들어간 유기적, 사회적, 언어학적 등 요소들과 독립해 충분히 멀리 가지 못한 기능주의요, 욕망이 기계 작동하는 저 영역들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기능주의이다. 기능주의가 알아야 하는 유일한 다양체-통일체들은 욕망 기계들 자체 및 욕망 기계들이 생산장의 모든 부문에서 형성하는 배열 형태들뿐이다(<총체적 사실>을 알 필요는 없다). 마법의 사슬은 식물들, 기관들, 쪼가리들, 옷자락, 아빠의 이미지, 공식들과 낱말들을 집결한다. 물어봐야 할 것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어떤 기계가 조립되는가, 어떤 흐름들과 어떤 절단들이 다른 흐름들 및 다른 절단들과 관계를 맺는가이다. p.312~313
민족학자들이 오늘날 물신이라는 가설적 개념에 생생한 흥미를 보이고 있다면, 이는 확실히 정신분석의 영향 때문이다 하지만 정심분석은 그들에게 이 개념에 주의를 끌 근거 못지않게 이 개념을 의심할 근거를 주고 있다 하겠다. 왜냐하면 정신분석은 물신에 관해서 오직 "남근-오이디푸스-거세"만을
Who am I? I am a man. I have a girlfriend. I am a son. I am not a student anymore. I am a person. Am I exiled? Yes I am exiled. I am exiled because I hear some voices of other people right now. Yes. The event is over. I am exiled and criticized by other people. I don't belong here anymore. Where then I belong to? I am exiled because I am writing this thing even people surrounds me.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기에 본질적인 것은 기입의 요구들에 엄밀하게 의존하는 교환과 순환이 아니라, 기입 그 자체 및 그 낙인들, 몸들에 쓴 그 알파벳, 그 부채 블록들이었다. 유연한 구조가 기능할 때면 언제든지, 또 순환시킬 때면 언제든지, 기입들을 관장하는 견고한 기계적 요소가 있으리라. p.324
니체는 다른 절단들을 설립하는 데까지 도달하리라. 즉 희랍 도시, 그리스도교, 민주주의적인 부르주아 휴머니즘, 산업사회, 자본주의, 사회주의라는 절단들을. 하지만 이 모든 절단은, 저 최초의 거대한 절단을 격퇴하고 이것을 다시 채운다고 주장하지만, 갖가지 명목으로 저 위대한 절단을 전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교회 국가건 세속 국가건, 폭정 국가건 민주국가건, 자본주의국가건 사회주의국가건, 지금까지 오직 하나의 국가만이 있어 왔다. 즉 <입김을 뿜고 포효하며 말하는> 위선적인 개-국가만이. 그리고 니체는 이 새로운 사회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암시한다. 그것은 유례없는 공포인데, 이에 비하면 고대의 잔혹 체계, 훈육과 벌의 원시적 형식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모든 원시 코드화를 협의해서 파괴하며, 또는 더 고약하게는, 이것들을 조롱하며 보전하고, 이것들을 새 기계, 새 억압 장치의 2차적 부품들로 환원한다. 원시 기입 기계의 본질을 이루고 있었던 것, 즉 이동하는 열린 유한 부채 블록들, <운명의 작은 조각들>, 이것들 모두는 부채를 무한한 것이 되게 하며 이제 단지 하나의 동일한 박살 내는 숙명만을 형성할 뿐인 하나의 거대한 톱니바퀴 속으로 들어갈 처지이다. <이제 완전 상환의 전망은 곧 단번에 염세적으로 닫혀야만 하고, 이제 눈길은 청동의 불가능성 앞에 절망적으로 부딪혀 튕겨 나와야만 한다.....> 대지는 하나의 정신병원이 된다. p.331
소쉬르는 다음과 같은 점, 즉 <대중>이 겪고 있는 예속 또는 일반화된 노예 상태처럼 언어의 자의성이 언어 주권의 기초가 되고 있다는 점만을 강조하지는 않는다. 또한 소쉬르에게 어떻게 두 차원이 존속하는지도 밝힐 수 있었다. 하나는 수평적 차원인데, 여기서 기의는 기표가 거기서 해체되는 공존하는 최소 항들의 가치로 환원된다. 다른 하나는 수직적 차원인데, 여기서 기의는 청각 이미지에 대응하는 개념까지, 말하자면 기표를 재구성하는 그 외연의 최대치에서 포착되는 목소리까지 상승한다(공존하는 항들의 상대역으로서의 <가치>와 청각 이미지의 상대역으로서의 <개념>). 요컨대, 기표는 두 번 나타난다. 한 번은 요소들의 사슬 속에 나타나는데, 이 요소들과 관련해서 기의는 언제나 다른 기표에 대한 기표이다. 또 한 번은 이탈된 대상 속에 나타나는데, 사슬 전반은 이 대상에 의존하며 또 이 대상은 사슬 위에 의미화의 효과들을 뿜어낸다.p.355
기표 제국주의는 우리에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라는 물음 밖으로 나가게 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 물음을 미리 차단하고 모든 답을 단순한 기의의 신분으로 되돌려 모든 답을 불충분하게 만드는 데 그친다. 그것은 암송, 순수 텍스트성, 우월한 과학성의 이름으로 주해를 거부한다. 너무 급하게 구절의 물을 마시고 이렇게 끊임없이 외치는 궁정의 하룻강아지들 같다. 기표여, 자넨 아직 기표에 이르지 못했어, 자넨 아직 기의들에 머물러 있어! 기표, 단지 이것만이 개들을 기쁘게 한다. 하지만 이 주인-기표는 오래전 시대의 본연의 모습 그대로 있다. 하지만 이 주인-기표는 오래전 시대의 본연의 모습 그대로 있다. 사슬의 모든 요소에 결핍을 분배하는 초월적 재고, 공통된 부재를 위한 공통된 어떤 것, 유일하고 동일한 절단의 유일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모든 흐름-절단을 창설하는 자인 채로. 즉 그것은 이탈된 대상, 남근-과-거세, 우울한 신민들을 위대한 편집증자 왕에게 복종시키는 막대기이다. 오! 기표여, 전제군주의 무서운 의고주의여! 여기서 사람들은 여전히 빈 무덤, 죽은 아버지, 이름의 신비를 찾고 있다. 필경 이것이 라캉에 대해, 또한 그 신봉자들의 열광에 대해, 오늘날 몇몇 언어학자의 분노를 유발하는 것이리라. 라캉은, 힘차고 차분하게 기표를 그 원천, 그 진정한 기원인 전제군주 시대까지 데려가, 욕망을 법에 용접하는 폭탄을 설치하고 있다. 왜냐하면 라캉이 생각하기에는, 모든 성찰을 해 보면, 바로 이런 형식으로 기표는 무의식과 부합하며 거기에서 기의의 효과들을 생산하기 때문이다. 억압하는 재현작용으로서의 기표와 이것이 유도하는 이전된 새 재현내용, 저 유명한 은유들과 환유들, 이 모든 것이 초코드화하고 탈영토화된 전제군주 기계를 구성한다. p.357
제국의 야만적 법은 오히려 이런 법에 반대되는 두 성격을 띠는데, 카프카는 이 두 성격을 아주 힘차게 펼쳐 냈다. 그 하나는 이 법의 편집증적-분열증적 특징인데(환유) 그에 따르면 법은 전체화할 수도 없고 전체화되지도 않은 부분들을 지배하며, 이 부분들을 세분하고, 이 부분들을 벽돌들로 조직하며, 이 부분들의 거리를 재고, 이 부분들의 소통을 금하며, 이런 연후부터는 무섭지만 형식적이며 텅 빈, 탁월하며 분배적이고, 비집단적인 하나의 통일체의 자격으로 작용한다. 다른 하나는 조울증적 특징인데(은유) 그에 따르면 법은 아무것도 알리지 않고, 알 수 있는 대상도 갖지 않으며, 처벌에 앞서 실존하지 않으며, 법의 언표가 판결에 앞서 실존하지 않는다. 신명 재판은 이 두 특징을 생생한 상태로 보여 준다. <유형지에서>의 기계처럼, 판결과 규칙 모두를 기록하는 것은 바로 처벌이다. 함의 체계에서 자기에게 고유한 것이던 표기행위로부터 몸은 해방되었지만 이는 아무 소용없다. 몸은 이제 새로운 글이 자기 형상들, 자기 음성조직, 자기 알파벳을 표시할 수 있는 돌과 종이, 판과 화폐가 된다. 초코드화하기, 이것이 법의 본질이며, 몸의 새로운 고통들의 기원이다. 벌은 결연과 혈연들의 마술 삼각형에서 눈이 잉여가치를 뽑아내는 축제이길 그쳤다. 벌은 복수가 된다. 이제는 전제군주에 통합된 목소리, 손, 눈의 복수가, 그 공적 성격이 비밀을 하나도 바꿔놓지 않은 새 결연의 복수가. <나는 그대에게 결연의 복수의 복수하는 검을 내리치리라.....> 왜냐하면 다시 말하거니와, 법은 전제주의에 대항하는 보증의 시늉이기 전에 전제 군주 자신의 발명이기 때문이다. 법은 무한 부채가 띠는 사법적 형식이다. 로마제국의 후기 황제들에 이르기까지, 전제군주의 수행원 속에서 법률가를 볼 수 있으며, 사법적 형식이 제국 구성체를 동반함을 볼 수 있다. 입법자는 괴물 옆에. 가이우스와 콤모두스, 파피니아누스와 카라칼라, 울피아누스와 헬리오가발루스. <열두 황제의 망상, 로마법의 황금시대.> (무한 부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채권자에 맞서 채무자 편을 들라.) p.362-363
무한 부채의 형식 - 잠복, 복수, 원한감정
복수, 미리 행사되는 하나의 복수로서, 제국의 야만적 법은 작용, 작용받음, 반응으로서의 원시적 놀이 전체를 분쇄한다. 이제 수동성은 전제군주의 몸에 매달린 신민들의 덕이 되어야 한다. 제국 구성체에서 어떻게 벌이 복수가 되는가를 정확시 밝힐 때 니체가 말하듯이, <그들의 망치질과 그들의 예술가적 폭력의 압력 아래 엄청난 양의 자유가 세계로부터, 적어도 가시권에서 추방되었으며, 곧 잠복적인 것이 되어.....>야만 했다. 죽음 본능의 고갈이 생산된다. 죽음 본능, 그것은 숙명론이 여전히 어떤 작용을 받는 것으로 존재하는 미개의 작용들과 반응들의 놀이 속에서 코드화되기를 그치면서, 초코드화의 어두운 담당자가 되고 각자에게 드리운 이탈된 대상이 되는데, 이는 마치 사회 기계가 욕망 기계들에서 뜯겨 나오기라도 한 것 같다. 죽음 본능, 그것은 죽음이고, 욕망의 욕망이며, 전제군주의 욕망의 욕망이고, 국가 장치의 가장 깊은 곳에 기입된 잠복성이다. 유일한 기관이기보다는 유일한 생존자, 그는 이 장치에서 흘러 나가지 않으며, 또는 전제군주의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는다. 자신의 기의들과 관련을 맺는 기표의 필연성(운명) 이외에 다른 필연성은 더 이상 없다. 이런 것이 공포 체제이다. 법이 의미하는 것이라 여겨지는 것은 나중에야, 즉 법이 진화해서 전제주의에 맞서는 듯한 새로운 모습을 띠었을 때에라야 인식되리라. 그런데 처음부터 법은, 앎을 피하고 모든 것이 자기들의 탁월한 원인에서 유래하는 그만큼 더 실효적이고 필수적인 효과들로서 자신의 기의들을 생산하는 기표의 제국주의를 표현한다. 법이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려 하고, 그 기의의 독립성을 내세우려 할 때(전제군주에 맞선다고 법은 말한다) 어린 개들이 주해도 해석도 없이 전제군주 기표로의 회귀를 요구하는 일이 여전히 있다. 왜냐하면 실상 이 개들이 좋아하는 것은, 카프카의 관찰에 따르면, 위선적인 박사들이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는 욕망이 죽음 본능의 순수한 고갈 속에서 법과 긴밀하게 맺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p.364
기호가 욕망의 정립이기를 그치고 이 제국적 기호, 즉 욕망을 법에 용접하는 보편적 거세가 될 때, 지시가 어떻게 존속하랴? 지시들을 자의적인 것과 결부하는 것(또는 지시들을 옛 체계에 잔존하는 벽돌들 속에서 존속시키는 것)은 옛 코드의 분쇄, 의미화의 새로운 관계, 초코드화에 기초한 이 새로운 관계의 필연성이다. 왜 언어학자들은 전제군주 시대의 진실들을 끊임없이 째발견할까? 그리고 결국, 의미화의 필연성과 표리를 이루고 있는, 지시들의 이 자의성은 전제군주의 신민들 내지 나아가 그 종복들에게만 미치지 않고, 전제군주 자신, 그의 왕조, 그의 이름에도 미칠 수 있을까(<백성들은 어느 황제가 통치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며, 왕조의 이름조차 의심스럽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죽음 본능이 흔히 믿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이 국가 속에 있고, 또 거기서 잠복이 신하들에게 작동할 뿐 아니라 최고의 톱니바퀴들 속에서도 작동한다는 것이겠다. 복수는 전제군주에 맞선 신민들의 복수가 된다. 공포의 잠복 체계 속에서, 더 이상 능동적이거나 작용받거나 반응적이지 않은 것, <폭력에 의해 잠복하게 된 것, 억압되고 물러나고 내부로 감금된 것>, 바로 이것은 이제 감정을 품게 된다. 신민들의 영원한 원한감정은 전제군주들의 영원한 복수에 답한다. 기입이 더 이상 작용받지도 반응하지도 않을 때 그것은 <감정을 품게> 된다. 탈영토화된 기호가 기표가 될 때, 엄청난 양의 반응이 잠복 상태로 옮겨 가며, 공진 전체, 봉 전체가 부피와 시간을 바꾼다(사후성). 복수와 원한감정, 그것은 물론 정의의 시작이 아니라, 니체가 분석하듯, 제국 구성체 안에서 정의의 생성과 그 운명이다. 그리고 니체의 예언에 따르면, 국가는 그 자체가 죽기를 원하는, 하지만 또 그 재에서 다시 태어나는 저 개일까? 왜냐하면 체계의 유지를 확보하고 한 이름이 다른 이름을, 한 왕조가 다른 왕조를 계승하게 하되, 기의들이 바뀌지 않도록 하고 기표의 벽이 균열되지도 않도록 하는 것은, 바로 새로운 결연 내지 무한 부채의 이 집합 전체 -지시들이 자의성을 지닌, 기표의 제국주의, 기의들의 은유적 또는 환유적 필연성- 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까닭에 아프리카, 중국, 이집트 등 제국에서 잠복의 체제는 끊임없는 반항과 이반의 체제였지만 혁명의 체제는 아니었다. 여기서도 여전히 죽음은 안에서부터 느껴지는 것이되 밖에서 오는 것이어야 했으리라.
제국의 창설자들은 이런 것을 가능케 했다..... 니체는 전제군주 기표로서의 황제와 이 황제의 두 기의인 누이와 어머니를 자기가 데리고 다니고, 광기에 근접하면서 이들이 점점 더 무겁다고 느꼈는데, 이때 니체는 무엇을 의미했을까? 오이디푸스가 제국적 재현 속에서 자신의 세포적, 난자적 이주를 시작했던 것은 진실이다. 오이디푸스는 욕망의 이전된 재현내용에서 출발해 억압하는 재현작용 자체가 된 것이다. 불가능이 가능해졌다. 점유되지 않았던 극한이 이제 전제군주에 의해 점유된다. 오이디푸스는 자기 이름을 얻었다. 언어 재현에 종속하는 몸 재현들로서 초코드화에 의해 누이 및 어머니와 이중의 근친상간을 행하는 안짱다리 전제군주. 더욱이 그 오이디푸스는 자기를 가능하게 하는 다음과 같은 형식적 조작들을 하나하나 해 간다. 즉 이탈된 대상의 외삽, 초코드화 또는 왕실 근친상간의 이중 구속, 일대일대응 만들기, 주인과 노예 사이의 사슬의 적용 및 선형화, 욕망 속에 법의 도입, 욕망을 법 아래로 도입, <나중> 내지 <사후성>을 지닌 끔찍한 잠복. 이렇게 다섯 가지 오류 추리의 모든 부품이 준비된 것 같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정신분석의 오이디푸스로부터 아주 멀리 있다. 희랍 연구가들이 정신분석이 기어이 그들의 귀에 읊조리는 이야기를 잘 파악하지 않는 것도 옳은 일이다. 그것은 바로 욕망의 이야기이며, 성적 욕망의 이야기이다(다른 이야기는 없다). 하지만 그 모든 부품은 여기서 국가의 톱니바퀴로 작동한다. 물론 욕망은 아들, 어머니, 아버지 사이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욕망은 국가 기계의 리비도 투자를 실행한다. 이 국가 기계는 영토 기계들을 초코드화하고, 보조 나사를 조여, 욕망 기계들을 억압한다. 근친상간은 이 투자에서 나온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며, 우선은 전제군주, 누이, 어머니만을 작동한다. 그것은 초코드화하며 억압하는 재현작용이다. 아버지는 낡은 영토 기계의 대표로만 개입하지만, 누이는 새로운 결연의 대표요 어머니는 직접 혈연의 대표이다. 아버지와 아들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 모든 성욕은 기계들 사이에서 발생한다. 기계들 간의 투쟁, 중첩, 벽돌 쌓기인 것이다. 프로이트가 보고한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보자. <모세와 일신교>에서 그는 잠복이 국가의 일임을 잘 느끼고 있다. 하지만 이때 잠복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뒤이어 나타나서는 안 되며, 이 콤플렉스의 억압 내지 심지어 제압을 표시해서도 안 된다. 잠복은 아직은 억압된 욕망으로서의 콤플렉스가 전혀 아닌 근친상간적 재현의 억압하는 작용에서 나와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와는 반대로 잠복은 욕망 자체에 억압의 작용을 실행하기 때문이다. 정신분석에서 부르는 그런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잠복에서, 잠복 후에 태어날 텐데, 그것은 욕망을 왜곡하고 이전하고 심지어 탈코드화하는 조건들 속에서 억압된 것의 회귀를 의미한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잠복 후에야 나타난다, 그리고 프로이트가 잠복에 의해 분리된 두 시간을 인정할 때, 콤플렉스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것은 오직 둘째 시간이며, 반면에 첫째 시간은 완전히 다른 조직 속에서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기능하는 잠복의 부품들과 톱니바퀴들만을 표현한다. 바로 여기에 정신분석의 모든 오류추리와 그 조증이 있다. 즉 콤플렉스의 결정적 설립 내지 내부 설치인 것을 콤플렉스의 해결 내지 해결의 시도로 제시하고, 여전히 이 콤플렉스의 반대인 것을 콤플렉스로 제시하고 있다. 왜냐하면 오이디푸스가 그 오이디푸스 자신,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할까? 사실 많은 것이 필요하다. 이것들을 니체는 무한 부채의 진보에서 부분적으로 예감하고 있었다.p.365-368
도대체 사유재산, 부, 상품, 계급들은 무엇을 의미할까? 코드들의 파산이다. 그것은 사회체 위를 흐르고 사회체의 도처를 가로지르는 이제는 탈코드화된 흐름들의 출현이자 돌출이다. 더 이상 국가는 이미 코드화된 영토적 요소들을 초코드화하는 데 그칠 수 없다. 국가는 점점 더 탈영토화된 흐름들을 위한 특유의 코드들을 발명해야만 한다. 즉 전제주의를 새로운 계급 관계들에 이바지하게 하기, 부와 빈곤의 관계들, 상품과 노동의 관계들을 통합하기, 시장의 돈과 징세의 돈을 조정하기, 도처에서 새로운 사태 속에 원국가를 다시 불어넣기 등. 그리고 도처에, 필적할 수 없겠으나 모방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잠복 모델이 있다. 희랍인들을 향한 이집트인의 우울한 경고가 울려 퍼진다. <너희 희랍인이여, 너희는 영원히 아이로만 있으리라!>
시작과 기원
범주로서의 국가라는 이 특수한 상황, 즉 망각과 회귀는 설명되어야만 한다. 기원적인 전제군주 국가는 다른 절단들과 같은 하나의 절단이 아니다. 모든 제도 가운데, 필경 그것은 그것을 설립하는 자들의 뇌 속에서 완전 무장하여 출현한 유일한 것이다. 바로 이런 까닭에 맑스주의에서는 그것을 어찌해야 할지 너무나도 몰랐다. 그것은 저 유명한 다섯 단계, 원시 공산주의, 고대 도시국가, 봉건제, 자본주의, 사회주의에 들어 있지 않다. 그것은 다른 구성체들 중 한 구성체가 아니며, 한 구성체에서 다른 구성체로의 이행도 아니다. 그것은 그것이 절단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리고 재절단하는 것과 관련하여, 마치 하나의 다른 차원을 증언하기라도 하는 양, 퇴각해 있다고 말할 수 있으리라. 이 다른 차원이란 사회의 물질적 진화에 다시 덧붙여지는 뇌의 이념성, 부분들과 흐름들을 하나의 전체 속에 조직하는 규제 이념 내지 반성 원리(공포)이다. 전제군주 국가가 절단 내지 덧절단 내지 초코드화하는 것은 예전에 있던 것, 즉 영토 기계인데, 전제군주 국가는 그것을 그 이후로 는 뇌의 관념에 복속된 벽돌들, 작동 부품들의 상태로 환원한다. 이런 의미에서, 전제군주 국가는 바로 기원이지만, 그것과 구체적 시작과의 차이가 이해되어야만 하는 추상으로서의 기원이다. p.372-374
더 이상 국가는 유지되어 벽돌처럼 된 영토성들을 초코드화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국가는 돈, 상품, 사유재산의 탈코드화된 흐름들을 위해 코드들을 구성하고 발명해야만 한다. 국가는 더 이상 스스로 하나 또는 여러 지배계급들을 형성하지 않는다. 자기 권력을 위해, 피지배계급들과의 모순들, 투쟁들, 타협들을 위해 국가를 대리로 내세우는 독립을 이룬 이 지배계급들에 의해 국가 자체가 형성된다. 국가는 더 이상 파편들을 통치하는 초월적 법이 아니다. 국가는 그럭저럭 하나의 전체를 설계해서 여기에 자신을 내재화해야만 한다. 국가는 더 이상 자신의 기의들을 정돈하는 순수한 기표가 아니다. 국가는 이제 자신의 기의들의 배후에 나타나 자신이 의미화하는 것에 의존한다. 국가는 더 이상 하나의 초코드화하는 통일체를 생산하지 않는다. 국가 자신이 탈코드화된 흐름들의 장에서 생산된다. 기계인 한에서, 국가는 더 이상 사회 체계를 규정하지 않는다. 국가는 자신의 기능들의 놀이 속에서 구현되는 사회 체계에 의해 규정된다. 요컨대 국가는 인공적인 것이기를 그치지는 않지만, 구체적인 것이 되고, <구체화로 향하며>, 이와 동시에 지배하는 힘들에 종속된다. 기술 기계가 추상적 통일체 또는 서로 떨어진 부분집합들을 지배하는 지적 체계이기를 그치고, 구체적 물리 체계로서 행사되는 힘들의 장에 종속되는 관계가 될 때, 기술 기계에 대해 이와 유사한 진보의 실존을 밝힐 수 있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해, 기술 기계 또는 사회 기계에서의 이 구체화를 향한 경향성은, 여기서 욕망의 운동 자체가 아닐까? 우리는 늘 다음과 같은 괴물 같은 역설에 거듭 빠진다. 즉 국가란 전제군주의 머리에서 신민들의 마음으로, 또 지적 법칙으로부터 이 법칙을 벗어나거나 이 법칙에서 놓여난 물리 체계 전체로 이행하는 욕망이라는 역설에 거듭 빠진다. 즉 국가란 전제군주의 머리에서 신민들의 마음으로, 또 지적 법칙으로부터 이 법칙을 벗어나거나 이 법칙에서 놓여난 물리 체계 전체로 이행하는 욕망이라는 역설에. 국가의 욕망, 즉 가장 환상적인 탄압 기계 역시도 욕망이며, 욕망하는 주체요 욕망의 대상이다. 욕망, 그것은 기원적 원국가를 새로운 사태 속에 다시 불어넣고 원국가를 가능한 한 새로운 체계에 내재하게 하고 새로운 체계 내부에 있게 하는 데서 언제나 성립하는 조작이다. 남는 것은 0에서 다시 출발하는 일이다. 즉 국가가 물리 체계 속에서 더 이상 국가로서 기능할 수 없는 그런 곳에, 또한 그런 형식으로, 하나의 종교 제국을 정초하는 일 말이다. 그리스도교도가 제국을 탈취했을 때, 1. 로마의 객관적 세계의 내재성 속에서 발견한 요소들로 가능한 한 원국가를 재건하기를 바랐던 사람들과 2. 다시 사막으로 떠나, 새로운 결연을 다시 시작하고, 초월적 원국가의 이집트적, 시리아적 영감을 되찾기를 바랐던 순수한 사람들 사이에, 이 보완적 이원성이 다시 발견되리라. 기둥들 위에서 나무둥치들 위에서 이 얼마나 이상한 기계들이 솟아오르는가! 그리스도교는 이런 의미에서 편집증 기계들과 독신 기계들의 놀이 전체를, 이들 또한 우리 역사 지평의 그리스도교는 이런 의미에서 편집증 기계들과 독신 기계들의 놀이 전체를, 이들 또한 우리 역사 지평의 일부를 이루며 우리 달력을 가득 채우고 있는 편집증자들과 변태들의 대열 전체를 전개시킬 줄 알고 있었다. 이것이 국가 생성의 두 양상이다. 그 하나는 하나의 물리 체계를 형성하는, 점점 더 탈코드화된 사회적 힘들의 장에서 국가의 내부화이며, 다른 하나는 하나의 형이상학적 체계를 형성하는, 점점 더 초코드화하는 초지상적 장에서 국가의 정신화이다. 무한 부채가 내면화되는 것과 정신화되는 것은 동시에 잇어야 한다. 양심의 가책의 시간이 가까워 온다. 그것은 또한 가장 큰 냉소의 시간이리라. <내면적으로 되고 두려움에 자기 안으로 뒷걸음친 동물 인간의, 길들임이라는 목적으로 '국가' 안에 감금된 자의, 저 되돌아온 잔혹.....> p.377-379
따라서 봉건 체계의 붕괴를 야기하는 것은 자본주의가 아니며, 오히려 그 반대가 맞다. 바로 이런 이유로 그 둘 사이에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 점에서 전제군주 시대와 자본주의 시대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저들, 국가의 창설자들은 번개처럼 도래하기 때문이다. 전제군주 기계는 공시적인 반면, 자본주의 기계의 시간은 통시적이다. 자본가들은 일종의 역사의 창조성을 정초하는 계열 속에 번갈아 등장하는데, 참 낮선 구경거리다. 새로운 창조적 절단의 분열증적 시간이로다.
탈코드화 및 탈코드화된 흐름들의 결합
붕괴들은 흐름들의 단순한 탈코드화로 정의되며, 국가의 잔존들 내지 변형들을 통해 언제나 만회된다. 죽음이 안에서 올라오고, 또 욕망 자체가 죽음 본능, 즉 잠복이라는 것이 느껴지지만, 또한 이 욕망 자체가 잠재적으로 새 삶을 지닌 이 흐름들 쪽으로 이행한다는 것도 느껴진다. 탈코드화된 흐름들, 누가 이 새 욕망의 이름을 말하랴? 판매되는 재산들의 흐름, 유통되는 돈의 흐름, 그림자 속에서 준비되는 생산과 생산수단의 흐름, 탈영토화되는 노동자들의 흐름 - 자본주의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또 옛 체계가 이번엔 밖으로부터 죽기 위해서는, 이와 동시에 새 삶이 태어나고 욕망이 새 이름을 얻기 위해서는, 이 모든 탈코드화된 흐름의 만남, 이것들의 결합, 이것들 서로 간의 반작용이, 한 번에 생산되는 이 만남, 이 결합, 이 반작용의 우발이 있어야 하리라. 우발의 세계사가 있을 뿐이다. p.381-382
바로 이런 까닭에, 자본주의와 그 절단은 단순히 탈코드화된 흐름들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흐름들의 일반화된 탈코드화와 새로운 거대한 탈영토화 그리고 탈영토화된 흐름들의 결합에 의해 정의된다. 자본주의의 보편성을 만든 것은 바로 이 결합의 특이성이다. 많이 단순화해서, 우리는 미개 영토 기계가 생산의 연결들에서 출발했고, 야만 전제군주 기계가 탁월한 통일성에서 출발한 기입의 분리들 위에서 정초되었다고 말할 수 있었다. 하지만 문명 자본주의 기계는 무엇보다 결합 위에 설립되리라. 이때 이 결합은 이제 코드화를 벗어날 잔여물들이나 원시 축제들에서와 같은 완수-소비들만을 가리키지 않으며, 심지어 전제군주와 그 부하들의 사치 속에 있는 <최대의 소비>를 가리키는 것만도 아니다. 이 결합이 사회 기계의 맨 앞줄로 이행할 때, 역으로 그것은 한 계급의 과잉 소비로서의 향유로 연결되기를 그치는 것 같으며, 노동의 원시적 연결들을 탈영토화된 새로운 충만한 몸으로서의 자본에 결부한다는 조건에서, 이 유일한 조건에서, 이 연결들을 되찾는 <생산을 위한 생산> 속에서 사치 자체를 하나의 투자 수단으로 만들고 모든 탈코드화된 흐름을 생산으로 복귀시키는 것 같다. 생산을 위한 생산은, 노동의 원시적 연결들이 방출되어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참된 소비자이다(마치 맑스가 묘사한 <산업 내시>의 악마의 계약에서처럼, '만일......라면, 따라서 그건 네 거다'). p.383
우연을 가능하게 하는 것, 혹은 필연을 가능하게 하는 것, 그것은 기입이며 루만에 따르면 구별들에 의해서이다. 우리는 그것의 작동 방식에 대하여 생각해봐야 한다. 각종 금기들, 구분들, 터부들, 그것들은 사건을 우연과 필연이라는 두 극한에 의해서만 구별할 수 밖에 없게끔 규정한다. 여기서 감각이란, 어떤 것일까. 친밀도, 들어갔다 나오기, 감각에 선험하는 구분들은 과연 존재할 것인가? 혹은 구분들 자체가 감각을 구분한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지 않은가? 나는 상대방에 대해, 혹은 내가 보는 것에 대해 알 수 없다. 그러나 알 수 없다고도 할 수 없다. 이 구분에 의한 양극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이다. 단지 느끼고 이를 환원하지 않을 뿐이다.
시대는 이제 잔혹의 시대도 공포의 시대도 아닌 냉소의 시대이며, 냉소의 시대는 이상한 독실함을 동반하고 있다(이 둘은 휴머니즘을 구성한다. 냉소는 사회장의 물리적 내재성이며, 독실함은 정신화된 원국가의 존속이다. 냉소는 초과노동을 수탈하는 수단으로서의 자본이지만, 독실함은 이 동일한 자본이되 모든 노동력이 그로부터 유출되어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신-자본과도 같다). 이 냉소의 시대는 자본축적의 시대로, 이 시대는 정확히 말해 탈코드화되고 탈영토화된 모든 흐름의 결합을 위한 시간을 내포한다. 모리스 돕은 이 점을 밝힌 바 있다. 첫째 시간에는 재화가 그다지 비싸지 않은 유리한 정세(봉건 체계의 해체)에 재산, 가령 토지의 권리 증서들의 축적이 있어야만 한다. 둘째 시간에는 특히 이익을 가져오는 조건(<가격혁명>, 풍부하게 남아도는 일손, 프롤레타리아의 형성, 원료 자원에 대한 쉬운 접근, 도구와 기계의 생산에 유리한 조건들)에서 이 재화가 높은 값에 판매된다. 모든 종류의 우발적 요인들이 이 결합들에 우호적이다. 이름 붙일 수 없는 이 일의 형성을 위해 얼마나 많은 만남들이 있었던가! 하지만 결합의 결과는 실은 자본에 의한 점점 더 깊은 생산 통제이다. 자본주의 내지 자본주의 절단의 정의, 즉 탈코드화되고 탈영토화된 모든 흐름의 결합은, 다른 흐름들 중의 몇몇 흐름이요 다른 요소들 중의 몇몇 요소에 불과한 상업자본 내지 금융자본에 의해서가 아니라 산업자본에 의해 정의된다. 상업에 기초한 직종들에서 자신을 산업가가 되게 했건, 장인들을 자신의 중개인 또는 고용인이 되게 했건, 필경 상인은 아주 빨리 생산에 작용하고 있었다(길드들과 독점들에 맞선 투쟁들). 하지만 자본주의가 시작되고 자본주의 기계가 조립되는 것은, 자본이 생산을 직접 전유할 때뿐이며, 금융자본과 시장 자본이 자본주의 생산양식 일반에서 분업에 상응하는 특유한 기능이 될 때뿐이다. 이제 생산들의 생산, 등록들의 생산, 소비들의 생산이 다시 발견된다. 하지만 정확히 말해 이는 자본을 사회의 새로운 충만한 몸이 되게 하는 탈코드화된 흐름들의 저 결합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한편 상업적, 금융적 자본주의는 그 원시적 형식들 아래서 오직 옛 사회체의 털구멍들 속에만 설치되었을 뿐, 예전 생산양식을 바꾸지는 못하고 있었다. p.385~386
한편으로 코드들은 의고주의라는 명목으로라도 존속하고 있지만, 이 코드들은 인물이 된 자본(자본가, 노동자, 도매상, 은행가.....) 속에서 완전히 현행적이며 상황에 적응된 기능을 맡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더 깊은 수준에서, 모든 기술 기계는 특수한 유형의 흐름들을, 즉 기술과 심지어 과학의 요소들을 형성하는, 기계의 내부와 외부에 동시에 있는 코드의 흐름들을 전제한다. 전-자본주의사회들에서는 결코 독립성을 획득하지 못할 그런 방식으로 자신이 처박히거나 코드화되거나 초코드화되는 것은 바로 이 코드의 흐름들이다(대장장이, 천문학자......). 하지만 자본주의에서의 흐름들의 일반화된 탈코드화는 다른 흐름들과 같은 명목으로 코드의 흐름들을 해방하고 탈영토화하고 탈코드화했다. 그래서 자동 기계는 힘들의 장으로서 자신의 몸 내지 자신의 구조 속에서 언제나 흐름들을 내부화하고, 동시에 과학과 기술에, 즉 노동자의 육체노동과 구별되는 이른바 두뇌 노동에 의존하기에 이르렀다(기술 대상의 진화). 이런 의미에서, 자본주의를 만들었던 건 기계들이 아니며, 반대로 바로 자본주의가 기계들을 만드는 것이며, 자본주의가 자신의 기술적 생산양식을 변혁하는 새로운 절단들을 끊임없이 도입하는 것이다.
아직은 이 점에 대해 여러 교정을 가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절단들은 시간이 걸리며, 또 광범위하게 확장되기 때문이다. 통시적 자본주의 기계가 하나나 몇 개의 공시적 기술 기계에 의해 자신을 변혁시키도록 용인하는 일은 절대로 없으며, 또 예전 체제들에서 알려져 있지 않던 독립성을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에게 주는 일도 절대로 없다. 아마도 통시적 자본주의 기계는 과학자들, 가령 수학자들을 자기 분야에서 <분열증화>하게 용인할 수는 있으며, 이 과학자들이 이른바 기초연구의 공리계들로 조직하는 사회적으로 탈코드화된 코드의 흐름들을 통과시킬 수는 있다. 하지만 참된 공리계는 거기에 없다(어떤 지점까지는 학자들을 내버려두며, 그들 나름의 공리계를 만들게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중대한 사태가 벌어지는 순간이 온다. 가령 비결정론 물리학은, 자신의 입자 흐름들을 갖고, <결정론>과 화해해야만 한다). 참된 공리계는 사회 기계 자체의 공리계이다. 이 공리계는 옛코드화들을 대신하며, 과학과 기술 코드의 흐름들을 포함해서 탈코드화된 모든 흐름을 조직하여 자본주의 체계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목적들에 복무한다. 바로 이런 까닭에 산업혁명은 기계들과 과학들을 상당히 불신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기술 진보와 다량의 <퇴물> 장비의 유지를 조합했다는 지적이 자주 있어 왔다. 혁신은 그 투자가 생산 비용 절감을 통해 제공하는 이윤율에서 출발해서만 채택된다. 만일 전망이 좋지 않다면, 자본가는 다른 영역의 기존 장비들에 투자하는 것과 병행해서 투자할 각오로 기존 장비들을 유지한다. 따라서 인간적 이여가치는 심지어 중심부에서도 또 고도로 산업화된 부분들에서도 결정적 중요성을 간직한다. 기계적 잉여가치를 통한 비용 절감과 이윤율 제고를 규정하는 것은 혁신 자체가 아니다. 혁신 자체의 가치는 인간적 잉여 가치 못지않게 측정 불가능하다. 그것은 심지어 따로 떼어 가시화된 신기술의 수익성도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시장과의 관계, 또 상업자본 및 금융자본과의 관계 속에서 기업의 전반적 수익성에 끼치는 효과이다. 이것이, 가령 19세기부터 볼 수 있듯이, 증기기계와 직물 기계들 또는 제철 생산기술들의 통시적 만남들과 재절단들이 함축하는 바이다. 일반적으로 혁신의 도입은 언제나, 시장 전망치가 대규모 개발을 정당화하는 순간에 이를 때까지, 과학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넘겨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도, 결연 자본은 산업자본 내에서 기계적 혁신들에 강한 선별 압력을 행사한다. 요컨대 흐름들이 탈코드화된 곳에서는, 기술적, 과학적 형식을 띠는 코드의 특수한 흐름들은 모든 과학적 공리계보다도, 사라진 모든 옛 코드 내지 초코드화보다도 훨씬 더 냉혹한 고유의 사회공리계에 종속되는데, 이는 바로 자본주의 시장의 공리계이다. 요컨대 자본주의 체제에 의해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 <해방>된 코드의 흐름들은 기계적 잉여가치를 낳는데, 이 잉여가치는 과학과 기술 자체에 직접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에 의존하며, 또 인간적 잉여가치에 덧붙여져, 이 잉여가치의 상대적 저하를 교정한다. 그리하여 이 기계적 잉여가치와 인간적 잉여가치 양자가 이 체계의 특징을 이루는 흐름의 잉여가치의 집합을 구성한다. 지식, 정보, 전문교육은 노동자의 가장 기초적인 노동 못지않은 자본의 일부이다. 그리고 탈코드화된 흐름들에서 결과하는 한의 인간적 잉여가치 면에서, 우리는 육체 노동과 자본 간에, 또는 돈의 두 형식 간에, 통약 불가능성 내지 근본적 비대칭을 발견한 바 있는데(지정할 수 있는 그 어떤 외부 극한도 없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과학과 기술 코드의 흐름들에서 결과하는 기계적 잉여가치 면에서, 우리는 과학 노동 내지 기술 노동(아무리 보수가 높다 해도)과 다른 기록 속에서 기입되는 자본의 이윤 간에 그 어떤 통약 가능성도 그 어떤 외부 극한도 발견하지 못한다. 이런 점에서 지식의 흐름과 노동의 흐름은 자본주의적 탈코드화 내지 영토화에 의해 규정된 동일한 상황 속에 있다. p.395-398
왜 자본주의 생산은 자기 고유의 현실인 탈코드화된 흐름들을 구성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 나름으로 억압-탄압의 무지막지한 기계를 형성할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것은 자본주의가 다른 사회구성체들이 코드화하고 초코드화했던 흐름들의 탈코드화를 시행하는 한에서, 그야말로 모든 사회의 극한이기 때문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자본주의는 모든 사회의 상대적 극한들 내지 절단들이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극단적으로 엄격한 공리계로 코드들을 대체하기 때문인데, 이 공리계는 탈영토화된 사회체이기는 하지만 도한 다른 모든 사회체만큼이나 또는 심지어 그 이상으로 무자비한 사회체이기도 한 자본의 몸에 묶인 상태 속에 흐름들의 에너지를 유지한다. 반대로 분열증은 그야말로 절대적 극한으로, 자유로운 상태에서 흐름들을 탈영토화된 기관 없는 몸 위로 지나가게 한다. 따라서 분열증은 자본주의 자신의 외부 극한 또는 자본주의의 가장 깊은 경향성의 종결점이지만, 자본주의는 이 경향성을 억제하거나 이 극한을 밀어내고 이전한다는 조건 아래서만 기능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는 자신이 확장된 규모로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자본주의 고유의 내재적인 상대적 극한들로 분열증의 절대적 극한을 대체한다. 자본주의는 자기가 한 손으로 탈코드화하는 것을 다른 손으로 공리화한다. 맑스주의의 상반된 경향의 법칙은 이런 방식으로 재해석되어야 한다. 그래서 분열증은 자본주의장 전체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침투해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장 전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언제나 새로운 내부 극한들을 탈코드화된 흐름들의 혁명 권력과 대립시키는 하나의 세계적 공리계 속에 분열증의 충전들과 에너지들을 묶어 놓는 일이다. 이런 체제에서는, 설사 두 개의 시간으로 나누는 것일지라도, 탈코드화와 사라진 코드들을 대신하는 공리계를 구별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흐름들이 자본주의에 의해 탈코드화되는 일과 공리화되는 일은 동시에 일어난다. 따라서 분열증은 자본주의와의 동일성이 아니라, 반대로 자본주의와의 차이, 자본주의와의 편차, 자본주의의 죽음이다. 화폐의 흐름들은 완전히 분열증적 현실들이지만, 이 현실을 쫓아내고 밀쳐 내는 내재적 공리계 속에서만 실존하며 기능한다. 은행가, 장군, 산업가, 중간 간부나 고위 간부, 장관의 언어활동은 완전히 분열증적인 언어활동이지만, 언어활ㄷㅇ을 자본주의 질서에 봉사하게 하는 연계의 단조로운 공리계 속에서만 통계적으로 기능한다. 그렇다면 벽, 즉 절대적 극한을 통과하게 되는 <참으로> 분열증적인 언어와 <참으로> 탈코드화되고 풀려난 흐름들은 어떻게 될까? 자본주의 공리계는 아주 풍부하여, 공리가 하나 덧붙는데, 이렇게 하면 거장의 저서들의 어휘와 문체가 지닌 전자 기계로 계산 가능한 특성들을 언제나 연구할 수 있으며, 광인들의 담론을 병원, 행정, 정신의학의 공리계의 틀 안에서 언제나 들을 수 있다. 요컨대 분열-흐름 또는 흐름-절단의 개념은 분열증 못지않게 자본주의를 잘 정의하는 것으로 우리에게는 보였다. 하지만 이는 전혀 같은 방식으로가 아니며, 이 둘은 결코 같지가 않다. 자본주의와 분열증은 다음의 것들에 따라 서로 다르다. 즉 1. 탈코드화들이 하나의 공리계 속에서 회수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2. 통계적으로 기능하는 거대 집합에 머무느냐 아니면 이 집합들을 풀려난 분자적 위치들과 격리하는 장벽을 넘어가느냐에 따라, 3. 욕망의 흐름들이 저 절대적 극한에 도달하느냐 아니면 내재적인 상대적 극한을 이전해서 더 먼 데서 재구성하는 데 그치느냐에 따라, 4. 탈영토화의 과정들이 이 과정들을 통제하는 재영토화를 수반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5. 돈이 그저 불타느냐 작열하느냐에 따라. p.416-418
코드의 특성을 이루는 이 일반적 특징들을 바로 오늘날 유전 코드라 불리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음에 주의하자. 이는 유전 코드가 기표의 효과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반대로 유전 코드가 구성하는 사슬 자체가 단지 2차적으로만 기표적이기 때문인데, 이렇게 2차적으로만 기표적이 되는 것은 유전 코드가 서로 다른 질을 부여받은 흐름들 간의 짝짓기들, 오직 간접적인 상호작용들, 본질적으로 제한된 질적 합성물들, 세포의 연결을 선별하고 전유하는 지각기관들과 화학 외적 요인들을 작동시키는 한에서이다.
모든 점에서 코드들에 대립되는 하나의 사회 공리계에 의해 자본주의를 정의하는 많은 수의 근거들이 있다. 우선, 일반적 등가물로서의 화폐는 흐름들의 질적 본성과는 무관한 추상량을 재현한다. 하지만 등가 관계 자체는 제한되지 않은 것의 위치로 보내진다 '화폐-상품-화폐'의 공식에서, <자본으로서 화폐의 순환은 자기 목적이다. 왜냐하면 가치의 가치 증대는 항상 갱신되는 이 운동 내부에서만 실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의 운동은 한계가 없다.> p.420
이제 극한의 부재는 단지 제한된 추상량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것이 구체적인 어떤 것이 되는 미분 비를 위한 극한 내지 종결의 실효적 부재를 가리키기도 한다. 자본주의에 관해 우리는 그것이 외부 극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동시에 외부 극한을 하나 갖고 있다고도 말한다. 즉 그것은 분열증이라는 하나의 외부 극한을, 말하자면 흐름들의 절대적 탈코드화를 갖고 있지만, 또한 이 극한을 밀어내고 몰아내면서만 기능한다. 또 자본주의는 내부 극한들을 갖고 있으며 갖고 있지 않기도 하다. 즉 그것은 자본주의 생산과 유통의 특유한 조건들 속에, 말하자면 자본 자체 속에 내부 극한들을 갖고 있지만, 늘 더 방대한 규모로 이 극한들을 재생산하고 확대하면서만 기능한다. 그리고 자본주의 공리계가 포화상태에 이르는 법이 없고, 예전 공리들에 언제나 새로운 공리를 추가할 수 있다는 점이 바로 자본주의의 권력이다. p.422
언어활동은 더 이상 믿어야 하는 어떤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언어활동은 행해질 것을, 즉 악한들 또는 수완가들이 반 마디 말로도 탈코드화하고 이해할 줄 아는 것을 가리킨다. 더욱이, 신분증들, 자료 카드들, 통제 수단들이 지천으로 널렸지만, 자본주의는 몸에서 사라진 표시들을 보충하기 위해 책에 기록할 필요조차 없다. 남아 있는 것은 잔존물들, 현행 기능을 하는 의고주의들이다. 인물은 추상량들에서 파생되어 이 양들의 구체-화 속에서 구체적이 되는 그만큼 현실적으로 <사적>이 되었다. 표시되는 것은 이 추상량들이지, 더 이상 인물들 자신이 아니다. 네 자본 또는 네 노동력 말고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다. 단지 너만을 위한 공리를 만들어야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체계의 확대된 극한들 속에서 언제나 너를 되찾으리라. 이제 더 이상 기관들을 집단적으로 투자할 필요도 없다. 기관들은 자본주의에 의해 끊임없이 생산되는 떠다니는 이미지들에 의해 충분히 채워진다. 앙리 르페브르의 지적에 따르면, 이 이미지들은 사적인 것을 공공화하기보다 오히려 공적인 것을 사사화한다. 세계 전체가 가족 속에서 펼쳐진다. 사람들은 자기 텔레비전에서 떠날 필요도 없다. 나중에 보겠지만, 이것은 사적 인물들에게 체계 속에서 아주 특수한 역할을 준다. 그것은 적용의 역할이요, 더 이상 코드 속에서의 함축의 역할이 아니다. 오이디푸스의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 p.424
사회의 공리계가 자기 고유의 내재성을 채우는 방식, 자기 극한들을 밀어내거나 확대하는 방식, 공리들을 더 추가해서 체계가 포화되는 것을 막는 방식, 삐걱거리며 고장 나며 복원되면서만 잘 기능하는 방식 들, 이 모든 것은 결정하고 관리하고 반응하고 기입하는 사회 기관들을, 즉 기술 기계들의 기능으로 환원되지 않는 기술 관료와 관료제를 내포한다. 요컨대 탈코드화된 흐름들의 결합, 이 흐름들의 미분 비들, 이 흐름들의 분열들 내지 균열들은 국가를 주요 기관으로 삼는 하나의 전면적 조절을 요구한다. 자본주의국가는, 탈코드화된 흐름들이 자본의 공리계 속에 붙잡히는 한에서, 이런 흐름들의 조절자이다. 이런 의미에서 자본주의 국가는 우리가 보기에 추상적인 전제군주 원국가의 진화를 관장하는 것 같은 구체-화를 잘 성취하고 있다. 초월적 통일체에서 출발한 자본주의국가는 구체-화를 아주 잘 성취하기에, 다른 의미에서는 자본주의국가만이 원국가의 폐허 위에 설립되었던 다른 국가 형식들과 대조되게도, 원국가와의 참된 단절을, 하나의 절단을 재현한다. 왜냐하면 원국가는 초코드화에 의해 규정되었더랬기 때문이다. 고대 도시에서 군주제 국가에 이르는 원국가의 파생물들은 이미 탈코드화되었거나 한창 탈코드화되고 있는 흐름들에 이미 직면해 있었으며, 이 흐름들은 필경 국가를 힘들의 실효적 장에 내재시키고 종속시키고 있었다. 하지만 이 흐름들이 결합에 돌입하기 위한 상황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국가는 초코드화의 파편들과 코드들을 지키면서 다른 그것들을 발명하는 데 그칠 수 있었고, 온 힘을 다해 결합이 생산되는 것을 방해하기까지 했다. 자본주의국가는 이와는 다른 상황이다. 그것은 탈코드화되거나 탈영토화된 흐름들의 결합에 의해 생산되었다. 자본주의국가가 내재-화를 최고도로 이룬다면, 이는 그것이 코드들과 초코드화들의 보편화된 파탄을 인가하는 한에서요, 그것이 지금까지는 알려져 있지 않던 본성을 지닌 결합의 이 새로운 공리계 속에서 전적으로 진화하는 한에서이다. 한 번 더 말하건대, 이 공리계는 자본주의국가가 발명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공리계는 자본 자체와 합류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자본주의 국가가 이 공리계에서 탄생하며, 이 공리계에서 결과하고, 이 공리계의 조절을 보증할 따름이며, 이 공리계가 기능하기 위한 조건인 실패들을 조절하거나 심지어 조직하고, 이 공리계의 포화의 진전과 이에 상응하는 극한의 확대를 감시 내지 지도한다. 그 어떤 국가도 권력을 잃어 가면서 이토록 공들여서 경제력의 기호에 봉사한 적은 없었다.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 자본주의국가는 아주 일찍부터, 처음부터, 여전히 반쯤은 봉건적이거나 군주제적인 형식으로 관리하던 때부터 이 역할을 갖고 있었다. <자유>노동자들의 관점에서는 일손과 임금의 통제가 그것이요, 상공업 생산의 흐름의 관점에서는 독점 특권의 부여, 축적에 유리한 조건, 잉여 생산에 맞선 투쟁등이 그것이다. 자유 자본주의가 있었던 적은 없다. 반독점 행동은 무엇보다 상업자본 및 금융자본이 여전히 옛 생산 체계와 동맹을 맺고 있는 계기와, 또 갓 태어난 산업자본주의가 이 특권들을 성공적으로 폐지해야만 생산과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와 관련된다. 국가가 적절하게 행동한다는 조건 아래서는, 반독점 행동에서 국가의 통제라는 원리 자체에 맞선 투쟁이 전혀 없다는 점은, 중상주의가 생산에서 직접 이익을 확보하는 자본의 새로운 상업적 기능들을 표현하는 한에서, 중상주의에서 분명히 볼 수 있다. 일반 규칙으로서, 국가의 통제들과 조절들이 사라지거나 약화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일손이 풍부하고 시장이 평소와는 달리 확장되는 경우뿐이다. 말하자면, 자본주의가 충분히 큰 상대적 극한들 속에서 극소수의 공리들로써 기능하는 때 말이다. 이 상황은 오래전에 그쳤다. 이런 진화의 결정적 요인으로 고려해야만 하는 것이 강력한 노동계급의 조직화인데, 이 계급은 안정된 고도의 고용을 요구하고 강제로 자본주의의 공리들을 늘리도록 강요하며, 이와 동시에 자본주의는 늘 확대되는 규모로 자신의 극한들을 재생산해야만 한다(중심부에서 주변부로의 이전이라는 공리). 자본주의는 옛 공리들에 새 공리들, 즉 노동계급을 위한 공리, 조합들을 위한 공리 등을 끊임없이 추가함으로써만 러시아혁명을 소화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늘 새 공리들을 추가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다른 사정 때문에도, 아주 사소하고 가소로운 일들 때문에라도, 새 공리들을 추가하낟. 이것은 본질적인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자본주의 고유의 수동(passion)이다. 이리하여 국가는 생산과 그 계획 수립에 관련해서나 경제와 그 <화폐화>에 관련해서, 그리고 잉여가치와 (국가 장치 자체에 의한) 잉여가치의 흡수에 관련해서, 공리화된 흐름들의 조절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규정된다. p.425-427
코드들에 맞선 투쟁을 이끌고 흐름들의 보편화된 탈코드화와 합류하는 한에서, 부르주아지는 유일한 계급 자체이다. 이런 자격으로 하여 부르주아지는 자본주의 내재장을 채우기에 충분하다. 실제로 부르주아지와 더불어 새로운 어떤 것이 생산된다. 즉 목적으로서 향유의 사라짐, 추상적 부를 유일한 목적으로 삼는 결합에 대한 새로운 착상, 소비와는 다른 형식들을 띤 결합의 실현 등이 그것이다. 전제군주 국가의 보편화된 노예 상태는 적어도 주인들을 또 생산의 영역과는 구별되는 반생산 장치를 내포하고 있었다. 하지만 탈코드화된 흐름들의 결합, 모든 초월성 내지 외부 극한의 부정, 생산 자체 속으로의 반생산의 유출 등으로 정의되는 그러한 부르주아 내재장은 비길 데 없는 노예 상태, 전레 없는 종속을 설립한다. 더 이상 주인조차 없으며, 지금은 다만 다른 노예들에게 명령하는 노예들만 있을 뿐이다. 더 이상 밖에서 동물에게 짐을 지울 필요가 없으며, 동물 스스로 짐을 진다. 인간은 결코 기술 기계의 노예가 아니다. 인간은 사회 기계의 노예이다. 부르주아가 그 사례이다. 부르주아 전체를 놓고 보면, 부르주아는 자기의 향유와 아무 관련도 없는 목적들을 위해 잉여가치를 흡수한다. 부르주아는 가장 천한 노예보다 더 천한 노예요, 굶주린 기계의 우두머리 종이요, 자본을 재생산하는 짐승이요, 무한 부채의 내면화이다. <나도 종이다>라는 것이 주인의 새로운 말이다. <자본의 인물화로서만, 자본가는 절대적 치부의 충동을 축재가와 공유한다. 하지만 축재가에게서 개인적 광증으로 나타나는 것은 자본가에게는 사회적 매커니즘의 효과이며, 그 속에서 자본가는 단지 작은 톱니바퀴에 불과하다.> 잉여가치에 의해 정의되는, 즉 자본의 흐름과 노동의 흐름의 구별, 융자의 흐름과 임금 소득의 흐름의 구별에 의해 정의되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어디까지나 존재한다고 말할 사람도 있으리라. 하지만 이는 부분적으로만 참이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미분 비들 속에서 이 둘의 결합에서 태어나며, 끊임없이 자기 고유의 극한들을 확대하는 재생산 속에서 이 들을 통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르주아지는 이데올로기의 견지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공리계의 조직 자체 속에서 말할 권리가 있다. 오직 하나의 기계만이, 재화에서 절단되어 탈코드화된 변이하는 큰 흐름의 기계만이 있을 따름이며, 하나의 유일한 종들 계급만이, 탈코드화하는 부르주아지만이 있을 따름이다. 이 계급은 카스트와 신분을 탈코드화하고, 또 생산재나 소비재로 변환 가능한, 소득이라는 나뉘지 않는 흐름을 이 기계에서 뽑아내며, 임금과 이윤은 거기에 기초한다. 요컨대 이론적 대립은 두 계급 사이에 있지 않다. 왜냐하면 계급 개념 자체가 코드들의 <음화>를 가리키는 한, 이는 오직 하나의 계급밖에 없음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이론적 대립은 다른 데 있다. 즉 1. 자분의 충만한 몸 위에서 계급의 공리계에 들어가는 그런 탈코드화된 흐름들과, 2. 전제군주 기표에서 못지않게 이 공리계에서도 해방되며, 이 벽과 이 벽의 벽을 가로지르고, 기관 없는 충만한 몸 위를 흘러가는 탈코드화된 흐름들 사이에 이론적 대립이 있다. 이론적 대립은 계급과 계급-바깥에 있는 자들 사이에 있다. 또한 기계의 종들과 기계를 고장내거나 톱니바퀴를 고장 내게 하는 자들 사이에. 또한 사회 기계의 체제와 욕망 기계들의 체제 사이에. 또한 상대적 내부 극한들과 절대적 외부 극한 사이에. 이렇게 말해도 좋으리라. 자본가들과 분열자들 사이에 이론적 대립이 있다고. 이 둘은 탈코드화의 층위에서는 근본적으로 친밀하지만, 공리계의 층위에서는 근본적으로 적대적이다. p.428-430
시장과 계획 수립 간에 양자택일이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다. 계획 수립은 자본주의 국가에도 필연적으로 도입되며, 비록 국가 독점 시장이긴 해도 사회주의국가에서도 시장은 존속하고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바로 모든 문제의 해결을 전제하지 않고서 어떻게 참된 양자택일을 정의하랴? 레닌과 러시아혁명의 엄청난 성과는 객관적 존재 내지 객관적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계급의식을 만들어 내고, 그 결과로 자본주의국가들에 계급의 양극성을 인정하라고 강요한 것이었다. 하지만 레닌주의의 이 위대한 절단은 사회주의 자체 속에서 국가자본주의가 부활하는 것을 막지도 못했고, 또 고전적 자본주의가 자신의 두더지 같은 참된 작업을 계속함으로써 그 절단을 돌리는 것을 막지도 못했다. 고전적 자본주의는, 언제나 절단들의 절단들을 통해, 통제되지 않는 혁명적 요소들을 더 먼 곳으로, 주변부나 외딴 곳들로 몰아냄으로써, 인정된 계급의 부문들을 자신의 공리계에 통합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되니, 사회주의국가의 무섭고 완고하며 재빨리 포화되는 새로운 공리계와 자본주의국가의 유연하고 결코 포화되지 않으면서도 그만큼 위험하고 냉소적인 옛 공리계 간의 선택만이 남았다. 하지만 사실상 가장 직접적인 물음은, 산업사회가 잉여, 잉여의 흡수, 계획자이자 시장인 국가, 심지어 부르주아지 등의 등가물 없이도 지낼 수 있는지 여부를 아는 일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또한 이런 용어들로 제기된 물음이 잘 제기된 게 아니라는 점도 분명하다. 또한 가장 직접적인 물음이 당이나 국가 속에 구현된 계급의식이 계급의 객관적 이해관계를 배반하는지 아닌지를 아는 일도 아니다. 이러한 계급의 객관적 이해관계에는 흔히 일종의 가능한 자발성이 있다고 여겨지지만, 그것은 이 이해관계를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심급들에 의해 질식되어 있다. <변증법적 이성 비판>에서 사르트르의 분석에 따르면 계급의 자발성이란 없고 오직 <집단>의 자발성만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이 분석이 아주 옳은 것으로 보인다. 이로부터 <융합된 집단들>과 당이나 국가에 의해 대표되며 <계열적>인 채로 머무는 계급을 구별할 필요가 생긴다. 이 양자는 동일한 규모로 있지 않다. 계급의 이해관계는 그램분자적 거대 집합들의 차원에 머무르기 때문이다. 계급의 이해관계는 하나의 집단적 전의식을 정의할 따름이며, 이 전의식은 반드시 이와 구별되는 의식 속에서 재현되므로 이 층위에서는 의식이 배반하는지 아닌지, 소외하는지 아닌지, 왜곡하는지 아닌지를 물을 필요조차 없다. 이와 반대로 참된 무의식은 집단의 욕망 속에 있으며, 이 욕망은 욕망 기계들의 분자적 차원을 작동한다. 바로 여기에, 즉 집단의 무의식적 욕망들과 계급의 전의식적 이해관계들 사이에 문제가 있다. 나중에 보겠지만, 바로 여기에서 출발해야만, 이로부터 간접적으로 도출되는 물음들, 즉 계급의 전의식과 계급의식의 재현적 형식들에 대해, 이해관계들의 본성과 이것들의 실현 과정에 대해 물음들을 제기할 수 있다. 라이히는 욕망과 이해관계를 사전에 구별할 권리들을 요청하는 결백한 절박함을 지닌 채 항상 돌아온다. <지도부는 객관적 역사 과정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 외에는 다음을 이해하는 것보다도 더 절박한 과제를 갖고 있지 않다. a. 상이한 계층, 직업, 연령층, 성별은 자기 안에 어떤 진보적 욕망, 관념, 생각을 지니고 있을까. b. 이들은 진보적인 것에 굴레를 채우는 그 어떤 욕망, 불안, 생각, 관념을 자기 안에 지니고 있을까 - 전통적 고찰들.> p.431-433
대중들은 속지 않았다. 대중들은 파시즘을 원했다. 설명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사람들은 자기 이해관계에 거슬러서 욕망하는 수가 있다. 자본주의는 이것을 이용하는데, 사회주의, 당, 당 지도부도 이것을 이용한다. p.433
현대 국가의 기능이 탈코드화되고 탈영토화된 흐름들의 조절이라는 것이 참이라면, 이 기능의 주요 양상들 중 하나는 재영토화를 행하고, 그리하여 탈코드화된 흐름들이 사회 공리계의 어떤 끄트머리에서라도 도주하지 못하게 막는 일이다. 자본주의국가가 자본들의 흐름들을 대지로 끌어오기 위해 거기에 있지 않다면, 자본들의 흐름들은 쉽사리 달까지 미치리라는 인상을 가끔 받는다. 가령 융자의 흐름들의 탈영토화가 있지만, 구매력과 지불수단들에 의한 재영토화도 있다. 또는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가는 탈영토화 운동은 주변부의 재영토화를, 주변부의 일종의 경제적, 정치적 자기-중심화를 수반한다. 이는 때로는 사회주의 내지 자본주의라는 현대적 국가 형식으로, 때로는 지방 전제 군주들의 의고적 형식으로 일어난다. 극한에서는 탈영토화와 재영토화를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둘은 서로를 취하거나 아니면 동일한 과정의 표리와 같으니까. p.434-435
1. 미개 영토 기계에서의 연결-함의 체계, 이는 흐름들의 코드화에 대응한다. 2. 아만 전제군주 기계에서의 분리-종속 체계, 이는 초코드화에 대응한다. 3. 문명 자본주의 기계에서의 결합-조정 체계, 이는 흐름들의 탈코드화에 대응한다. p.440
하지만 <뒝벌이 (그리고 오직 뒝벌만이) 붉은 클로버가 재생산할 수 있기 전에 그것을 돕고 지원하기 때문에, 붉은 클로버에는 재생산 체계가 없다고 누가 말하랴? 아무도 그럴 수 없다. 뒝벌은 클로버의 재생산 체계의 일부이다. 우리들 각자는, 우리 자신의 것과는 완전히 별개인 존재성을 지닌 미세한 극미동물들에서 유래했다. (......) 이 피조물들은 우리 재생산 체계의 일부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기계들의 재생산 체계의 일부가 아니란 걸까? (......) 복합된 기계 전체를 단일한 대상으로 여김으로써 우리는 오도되었다. 사실, 복합된 기계는 하나의 도시 내지 하나의 사회로, 그 각 성원은 진실로 자신의 유에 따라 길러졌다. 우리는 하나의 기계를 하나의 전체로 보며, 그것에 하나의 이름을 붙이고, 그것을 개체화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지체들을 바라보며, 그 조합이 재생산 작용의 단일한 중심에서 생겨난 하나의 개체를 형성한다는 것을 안다. 따라서 우리는 단일한 중심에서 생겨나지 않는 재생산 작용은 있을 수 없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이 가정은 비과학적이다. 또한 증기기관이 같은 유의 하나 내지 둘의 다른 증기기관에 의해 전적으로 만들어진 적이 없다 해도, 우리가 증기기관들은 재생산 체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기에는, 그 단순한 사실이 충분치 않다. 사실상, 그 어떤 증기기관이건 그 각 부분은 그 자체의 특수한 양육자들에 의해 길러지는데, 이들의 기능은 저 부분, 그리고 저 부분만을 길러 내는 것이다. 반면 부분들을 하나의 전체로 조합하는 일은 기계적 재생산 체계라는 또 다른 부분을 형성한다.> 지나는 길에, 버틀러는 코드의 잉여가치 현상을 만나는데, 기계의 한 부분이 자기 고유의 코드 속에 다른 기계의 코드의 파편을 포획하고 그럼으로써 이 다른 기계의 한 부분 덕에 자신을 재생산할 때가 그때이다. 붉은 클로버와 뒝벌이 그렇다. 또는 서양란과 이것이 유인하는 수컷 말벌이 그러한데, 서양란은 자신의 꽃에 암컷 말벌의 모습과 향을 지님으로써 놈을 가로챘다.
욕망은 주체 안에 있지 않고, 욕망 안에 기계가 있다 - 잔여 주체는 다른 쪽에, 기계 쪽에, 온 둘레에, 기계들의 기생물, 기계화된 척추동물의 욕망의 장식품으로 있다. 요컨대 참된 차이는 기계와 생물, 생명론과 기계론 사이에 있지 않고, 생물의 두 상태이기도 한 기계의 두 상태 사이에 있다. 구조적 통일성 속에 사로잡힌 기계 및 특ㅇ한 데다 심지어 인물적인 통일성 속에 사로잡힌 생물은, 군중 현상들 또는 그램분자 집합들의 현상들이다. 바로 이런 자격으로 기계와 생물이 바깥에서 서로 관계한다. p.478
우리는 성욕을 <전기 폭풍>, <하늘의 파란색과 안개의 회청색>, 오르곤의 푸름, <성 엘모의 불과 태양흑점들>, 유체들과 흐름들, 물질들과 입자들 같은 유형의 우주적 현상들을 성욕에 철저히 인접시키는 것이, 성욕을 가족주의의 형편없는 작은 비밀로 환원하는 것보다 우리에겐 궁극적으로 더 적합해 보인다고 털어놓겠다. 우리는 로런스와 밀러가, 저 유명한 과학성의 관점에서조차도, 프로이트보다 성욕을 더 정당하게 평가하고 있다고 믿는다. 우리에게 사랑과 사랑의 권력과 사랑의 절망들에 대해 말해 주는 것은, 소파에 누운 신경증자가 아니라, 분열자의 침묵의 산책이요, 별들 아래서의 렌츠의 등반이요, 기관 없는 몸 위의 내공들 속에서의 부동의 여행이다. 라이히의 이론 전반에 관해 보자면, 그 비길 데 없는 장점은 리비도의 이중의 극을, 즉 현미경 미만 규모의 분자적 구성체로서의 극과 유기체적, 사회적 집합들 규모의 그램분자적 구성체들의 투자로서의 극을 밝힌 점이다. 부족한 것은 단지 양식의 확증들뿐이다. 그것이 왜, 어떤 점에서, 성욕일까? p.487-488
극장
신화, 비극, 꿈, 환상, -그리고 꿈과 환상과 관련해서 재해석된 신화와 비극,- 이런 것들이 정신분석이 생산의 선, 즉 사회적, 욕망적 생산의 선을 대체하는 재현적 계열이다, 생산의 계열을 대신하는 극장의 계열. 하지만 왜 주관적이 된 재현이 바로 이렇게 극장 형식을 취하는 것일까(<정신분석과 극장 사이에는 신비한 연줄이 있다.....>)? 사람들은 최근 몇몇 저자들이 내놓은 탁월하게 현대적인 답을 알고 있다. 즉 극장은 무한한 주관적 재현에서 유한한 구조를 끌어낸다. 끌어낸다는 말의 의미는 아주 복잡하다. 왜냐하면 구조란 그 자체의 부재만을 제시할 수 있거나, 또는 재현 속에서 재현되지 않은 어떤 것을 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흔히들 말하듯, 극장의 특권이란 그 결과들 속에서 구조의 현전과 부재를 동시에 표시하는 이 은유적, 환유적 인과성을 상연하는 일이다. 앙드레 그린은, 구조의 충분함을 유보할 때조차도, 개시자의 역할을 하며, 구조가 가시적이 되는 장소인, 구조의 현실화에 필요한 극장의 이름으로만 유보한다. 옥타브 마노니는, 믿음이라는 현상에 대한 훌륭한 분석에서, 극장이 구현하거나 상연하는 어떤 구조의 효과 아래서, 믿음의 부인이 사실상 어떻게 믿음의 변형을 내포하는지 밝히기 위해, 마찬가지로 극장 모델을 취한다. 재현이 객관적인 것이기를 그칠 때, 재현이 무한히 주관적인 것, 말하자면 상상적인 것이 될 때, 재현은 재현 주체의 자리 및 기능들, 이미지로 재현된 대상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형식적 관계들을 규정하는 하나의 구조와 결부되지 않는 한, 실효적으로 그 모든 결속을 잃는다는 점을 우리는 이해해야만 한다. 그런데 상징적인 것은 요소로서의 객체성과 재현의 관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주체들, 대상들 및 이들의 관계가 동시에 생겨 나오는 주관적 재현의 궁극적 요소들, 순수한 기표들, 재현되지 않는 순수한 대표들을 가리킨다. 이처럼 구조는 주관적 재현의 무의식을 가리킨다. 이 재현의 계열은 이제 '(상상적인) 무한한 주관적 재현 -극장의 재현- 구조적 재현'으로 제시된다. 그리고 바로 극장은 잠복된 구조의 요소들과 관계들을 구현하는 것으로 이 구조 자체를 상연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극장은 이 구조의 보편성을 드러내기에 알맞으며, 이 보편성은 숨은 대표들 및 그것들의 이주들과 다양한 관계들에 따라 구조가 되찾고 재해석하는 객관적 재현들 속에소 포함되어 있다. 사람들은 무의식의 구조라는 이름으로 모든 믿음을 회수하고 재개한다. 우리는 아지도 독실하다. 상상계의 기의들 안에서 구현되는 상징적 기표의 위대한 작동이, 보편적 은유로서의 오이디푸스가 도처에 있다. p.508-509
구조를 가로지르는 결핍의 결핍을 어디까지 전개할 참인가? 결국은 구조적 조작에 이른다. 이 조작은 그램분자적 집합 속에서 결핍을 설치한다. 이때 욕망적 생산의 극한, 즉 그램분자적 집합들과 그 분자적 요소들을 나누는, 객관적 재현들과 욕망 기계들을 나누는 극한은 이제 완전히 이전된다. 그램분자적 집합이 거세의 홈에 의해 파이는 한, 극한은 이 집합 자체만을 지나간다. 구조의 형식적 조작들은 사회라는 출발 집합을 가족이라는 도달 집합으로 복귀시키는 외삽, 적용, 일대일대응 등의 조작이며, 여기서 가족 관계는 <다른 모든 관계의 은유>가 되고 가족 관계는 분자적, 생산적 요소들이 자기 고유의 도주선을 따라가는 것을 방해한다. 그린은 극장적 재현 및 이 재현을 가시적이게 하는 구조와 정신분석의 친화성을 정초하는 근거들을 찾으면서 특히 눈길을 끄는 두 가지 근거를 지정한다. 하나는 극장이 가족 관계를 보편적인 은유적 구조 관계의 상태로 끌어올리는데, 이로부터 인물들의 상상적 놀이와 장소가 생겨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거꾸로 극장이 기계들의 놀이와 기능을 무대 뒤로, 즉 넘을 수 없는 것이 된 극한 뒤로 밀어 넣는다는 것이다(환상에서와 꼭 마찬가지로, 기계들이 거기에 있지만, 그것은 벽 뒤에 있다). 요컨대 이전된 극한은 더 이상 객관적 재현과 욕망적 생산 사이를 지나가지 않고 무한한 상상적 재현과 유한한 구조적 재현이라는 주관적 재현의 두 극 사이를 지나간다. 그래서 미규정 내지 미분화의 밤으로 향하는 상상적 변주들과 분별들의 길을 가는 상징적 불변항이라는 두 양상을 대립시킬 수 있다. 반비례 관계의 규칙, 즉 이중 구속의 규칙에 따라, 이쪽에서나 저쪽에서나 같은 것이 발견된다. 생산 전체가 주관적 재현의 이중의 막다른 골목에 끌려들어 갔다. 오이디푸스를 상상계로 돌려보내는 일은 언제나 가능하다. 하지만 오이디푸스가 결핍되어 있다는 사실로부터 오이디푸스는 더 강하게 더 전면적으로 더 결핍된 채 더 승리하면서 되돌아온다. 오이디푸스는 상징적 거세 속에서 전면적으로 되찾아진다. 그리고 확실히 구조는 가족주의를 빠져나갈 그 어떤 수단도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 반대로 가족이 문자 그대로의 객관적 가치들을 잃었을 때조차도, 구조는 가족을 옥죄고 가족에 보편적인 은유적 가치를 준다. 정신분석은 자신의 야망을 자백한다. 그 야망이란, 쇠락한 가족을 승계하는 일, 부서진 가족 침대를 정신분석의 소파로 대체하는 일, <분석의 상황>이 그 본질에 있어 근친상간적인 것이게 하고 그것이 그 자체의 시험 내지 보증이 되어 현실의 등가물이게 하는 일이다. 옥타브 마노니가 밝히고 있듯이, 결국 고려할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어떻게 거부 후에도 믿음이 계속될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는 계속해서 독실할 수 있을까? 우리는 객관적 재현들을 통과한 우리의 모든 믿음을 거부했고 또 잃어버렸다. 대지는 죽었고, 사막은 넓어진다. 늙은 아버지, 토지의 아버지는 죽었고, 아들인 전제군주 오이디푸스도 죽었다. 우리는 우리의 양심의 가책, 우리의 권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우리 삶과 더불어 홀로 있다. 무한한 주관적 재현 속에서 회전하는 이미지들만 있을 뿐. 하지만 우리는, 이 이미지들과 우리의 관계들을 규제하고 하나의 상징적 기표의 효과로서 우리의 동일시를 규제하는 하나의 구조의 바닥에서 이 이미지들을 믿는 힘을 되찾는다. <좋은 동일시>라..... 우리는 모두 극장의 귀염둥이 아기로, 오이디푸스 앞에서 울부짖는다. 나랑 비슷한 사람들만 있어요, 나랑 비슷한 사람들만 있어요! 모든 것이, 토지의 신화, 전제군주의 비극이, 극장에 투사된 그림자의 자격으로 회수된다. 큰 영토성들은 붕괴되었지만, 구조가 주관적이고 사적인 모든 재영토화를 실행한다. 정신분석이여, 이 무슨 변태적 조작이란 말인가, 거기서는 저 신관념론이, 저 부활한 거세 숭배가, 저 결핍의 이데올로기가, 즉 성의 의인적 재현이 정점에 이르누나! 진실로 이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모른다. 어떤 탄압 매커니즘에 봉사하고 있는지를, 왜냐하면 이들의 의도는 종종 진보주의적이므로. 하지만 오늘날 그 누구도, 적어도 모든 것이, 즉 오이디푸스와 거세, 상상계와 상징계, 존재의 불충분함 내지 어긋남에 대한 위대한 가르침 등이 미리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분석가의 진료실에 들어설 수는 없다. 기발한 물품으로서의 정신분석, 재영토화로서의 오이디푸스, 현대인을 거세의 <바위>에 다시 심는 자로서의 오이디푸스. p.511-513
오이디푸스는 자본주의 소비의 마지막 말로, 아빠-엄마를 천천히 조금씩 빨며 소파 위에서 막히고 삼각형화된다. <따라서 그것은......이다.> 관료 장치나 군사 장치 못지 않게 정신분석도 잉여가치를 흡수하는 매커니즘이며, 정신분석은 바깥에서 외래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회적 기능이 정신분석의 형식과 합목적성 자체를 표시한다. p.520
기계는 가족의 꿈에서는 언제나 폭탄이다. 기게는, 꿈이 자신의 무대에 갇히고 자신의 재현 속에서 체계화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절단들과 흐름들을 도입한다. 기꼐는 다른 데서나 밖에서 발전될 무의미의 환원 불가능한 요인을 현실계 자체의 연결들 속에서 가치 있게 만든다. 정신분석은 오이디푸스를 고집하고 있어서 이 요인을 아주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는 인물들과 환경들 위에서는 재영토화가 일어나지만, 기계들 위에서는 탈영토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슈레버의 아버지는 기계들의 매개를 통해 작용할까, 아니면 반대로 기계들이 이 아버지의 매개를 통해 기능할까? 정신분석은 재영토화의 상상적, 구조적 재현들 위에 고착되어 있는 반면, 분열-분석은 탈영토화의 기계적 지표들을 따른다. 궁극적인 불모의 토지, 소진된 마지막 식민지로서의 소파 위에 있는 신경증자와, 탈영토화된 회로에서 산책 중인 분열자 간에는 언제나 대립이 있다. p.525-526
오히려 찰스 채플린은 <모던 타임스>의 염세주의와 마지막 이미지의 낙천주의에 대해 말했다. 이 두 용어는 이 영화에 어울리지 않는다. 오히려 찰스 채플린은 <모던 타임스>에서 여러 압제적 현상들의 설계도를 아주 작은 규모로 건조한 터치로 그려 낸다. 이것이 근본적이다. 채플린이 연기한 주인공 인물은 수동적일 필요도 능동적일 필요도 없고, 동조적일 필요도 반항적일 필요도 없는데, 왜냐하면 그는 설계도를 그리는 연필 끝이자 선 자체이기 때문이다. (......) 바로 이 때문에 마지막 이미지에는 낙관주의가 없다. 이 조서의 결론에서 낙천주의가 뭔가를 하게 되리라고 볼 수는 없다. 등을 보이는 완전히 검은 이 남자와 이 여자, 이들의 그림자는 전혀 태양에 의해 투사되어 있지 않고, 어느 쪽도 향하고 있지 않다. 도로 왼쪽에 늘어선 전선 없는 전신주들과 오른쪽에 늘어선 잎이 없는 나무들은 지평에서 만나지 않는다. 지평은 없다. 정면에 있는 헐벗은 언덕들이 그 위로 불쑥 솟은 허공과 합류해서 하나의 경계를 형성할 뿐이다. 이 남자와 이 여자는 더 이상 삶 속에 있지 않다. 누가 봐도 명백하다. 이는 더 이상 염세주의도 아니다. 와야 할 것이 왔을 뿐이다. 그들은 자살하지 않았다. 경찰에 의해 무너지지도 않았다. 그리고 사건의 알리바이를 찾으러 갈 필요도 없으리라. 찰스 채플린은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평소처럼 빨리 가 버렸다. 그는 설계도를 그린 것이다.>
분열-분석은 자신의 파괴적 임무에 있어 가능한 한 가장 빨리 진행해야 하지만, 또한 환자가 개인사에서 겪는 재현적 영토성들과 재영토화들을 차례로 해체하면서 아주 참을성 있고 아주 신중하게만 진행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안에서 생기거나 밖에서 강요되는 여러 저항층들, 여러 저항 면들이 있기 때문이다. 과정으로서의 분열증, 과정으로서의 탈영토화는, 그것을 중단하거나 악화하거나 공전시켜, 그것을 신경증, 변태, 정신병 속에서 재영토화하는 정체들과 뗄 수 없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분열증의 과정은 창조하는 일을 할 수 있는 한에서만 자기를 해방하고, 자기 자신을 추구할 수 있고, 자기를 성취시킬 수 있다. 그러면 무엇을 창조할까? 하나의 새로운 대지이다. 어느 경우건 옛 땅들을 다시 지나가, 그 본성, 그 밀도를 연구해야 하고, 어떻게 그 땅 하나하나 위에서 그 땅을 넘어설 수 있게 해 주는 기계적 지표들이 결속될 수 있는지 탐구해야 한다. 신경증이라는 가족적, 오이디푸스적 땅들, 변태라는 인공적 땅들, 정신병이라는 정신병원 땅들, 바로 이 땅둘 위에서 어떻게 각 경우 과정을 되찾고 부단히 여행을 재개할 수 있을까?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분열-분석의 위대한 기도로, 거기서 모든 면은 분자적 도주선, 분열증적 돌파에 이르기까지 횡단된다. 이는 알베르틴의 얼굴이 한 존립면에서 다른 존립면으로 도약해 마침내 분자들의 성운 속에서 해체되는 입맟춤에서도 그러하다. 독자는 그런 한 장면에서 멈추고는 "그래, 프루스트가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곳이 바로 여기야"라고 말할 위험에 언제나 직면한다. 하지만 거미-화자는 끊임없이 거미줄들과 장면들을 해체하고 여행을 재개하며, 기계로 기능하면서 그를 더 멀리까지 가게 하는 기호들 내지 지표들을 탐색한다. 이 운동 자체가 유머, 블랙 유머이다. 오이디푸스의 가족적, 신경증적 땅들, 거기에서는 온전하며 인물적인 연결들이 설립되는데, 오, 화자는 거기에 정착하지 않고 머무르지도 않으며, 그것들을 가로지르고 모독하고 돌파하며, 심지어 구두끈 매는 기계로 자기 할머니를 처리한다. 동성애의 변태적 땅들, 거기서는 여자들과 여자들, 남자들과 남자들의 배타적 분리들이 설립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땅들도 그 밑을 침식하는 기계적 지표들에 따라 파열한다. 정신병의 땅들은 제자리에서 결합들이 일어나며 그 나름으로는 문제가 더 이상 제기되지 않는, 더 이상 그렇게 제기되지 않는 지점까지 횡단된다. 화자는 자기 자신의 일을 계속하여, 마침내 미지의 조국, 미지의 땅에까지 이르는데, 진행중인 자기 자신의 작품, <진행 중인> 잃어버린 시간 찾기는 오직 그것만을 창조하며, 이 작품은 모든 지표를 모으고 다룰 수 있는 욕망 기계로 기능한다. 연결들은 언제나 부분적, 비-인물적이며, 결합들은 유목적/다의적이며, 분리들은 포괄적인 이 새로운 영역들로 화자는 향해 가는데, 거기서는 동성애와 이성애가 더 이상 구별될 수 없다. 그곳은 횡단적 소통들의 세계로, 여기서는 마침내 징취된 비-인간적 성이 꽃들과 합류하며, 그곳은 새로운 땅으로, 여기서는 욕망이 그 분자적 요소들과 흐름들에 따라 기능한다. 이러한 여행이 반드시 외연을 지닌 큰 운동들을 내포하는 건 아니다. 그것은 방 안에서, 그리고 기관 없는 몸 위에서 움직임 없이 행해지며, 그것은 자신이 창조하는 대지를 위해 모든 대지를 해체하는 내공 여행이다. p.527-529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 소외와 정신적 소외 간에 배타적인 관계를 세우는 한, 이 두 소외를 이쪽 또는 저쪽에 배정하려 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하지만 흐름들의 탈영토화 일반은 그것이 재영토화를 포함하고 있는 한, 정신적 소외와 실효적으로 합류한다. 이 재영토화들은 탈영토화 자체를 특수한 흐름의 상태로만, 즉 광기의 흐름의 상태로만 존속시키는데, 이 광기의 흐름은 이 흐름이 다른 흐름들 속에서 공리게들과 재영토화의 적용들을 빠져나가는 모든 것을 재현하는 일을 떠맡기 때문에 광기의 흐름으로 정의되는 것이다. 역으로, 자본주의의 모든 재영토화가 흐름들이 체계에서 도주하는 것을 방해하고, 노동을 재산의 공리계 틀 안에, 욕망을 가족의 적용 틀 안에 가두는 한, 우리는 자본주의의 모든 재영토화 안에서 사회적 소외의 생생한 형식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하지만 이 사회적 소외는 신경증, 변태, 정신병에서 재현되거나 재영토화되는 정신적 소외를 그 나름으로 포함한다. 하지만 이 사회적 소외는 신경증, 변태, 정신병에서 재현되거나 재영토화되는 정신적 소외를 그 나름으로 포함한다. p.532
정신분석의 변태적 치료 전체는 가족 신경증을 인공신경증으로 변형하는 데 있으며, 정신분석가라는 사령관이 있는 작은 섬인 소파를 자율적이고도 궁극으로 인공적인 영토성으로 건립하는 데 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이 동요하고 마침내 우리를 아주 먼 다른 곳으로 인도하는 데는 아주 적은 노력으로 충분하다. 분열-분석의 작은 충격, 그것은 운동을 재개하고, 경향성을 부활시키며, 허상들을 새로운 토지의 지표가 되기 위해 인공적 이미지이기를 그치는 지점까지 밀어붙인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과정의 완성이다. 이는 미리 존재하는 약속된 땅이 아니라, 자신의 경향성, 자신의 박리, 자신의 탈영토화 자체를 따라 스스로를 창조하는 대지이다. 그것은 잔혹극의 운동이다. 왜냐하면 잔혹극만이 생산의 유일한 극장이기 때문이며, 거기서는 흐름들이 탈영토화의 문턱을 뛰어넘어 새로운 대지를 생산한다(이는 하나의 희망이 아니라 간단한 <확증>이자 하나의 <설계도>로, 여기서는 도주하는 자가 도주하게 하며, 자신을 탈영토화하면서 대지를 그린다). 혁명 기계, 예술 기계, 과학 기계, (분열)-분석 기계가 서로 다른 것의 부품들과 부분들이 되는 능동적 도주점. p.533-534
어떤 사회체가 주어졌을 때, 분열-분석은 다만 다음과 같은 것들을 묻는다. 그 사회체는 욕망적 생산에 어떤 자리를 남겨 둘까? 욕망은 거기서 어떤 동력의 역할을 맡을까? 욕망적 생산과 사회적 생산은 모든 면에서 체제를 달리하되 상이한 두 체제 아래 있으니, 이 두 생산 체제의 화해는 어떤 형식들로 이루어질까? -따라서 충만한 몸으로서 이 사회체 위에서 한 국면에서 다른 국면으로 이행할 가능성, 말하자면 사회적 생산의 그램분자적 집합들이 조직되는 국면에서 욕망적 생산의 분자적 다양체들이 형성되는 적잖이 집단적인 다른 국면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있을까? -욕망적 생산과 사회적 생산은 체제가 다른 같은 생산이니, 그러한 사회체는 욕망적 생산이 사회적 생산을 자신에게 예속시키되 파괴하지는 않는 권력의 전복을 견딜 수 있을까, 또한 어느 지점까지 견딜 수 있을까? -주체 집단들의 구성체라는 것이 도대체 있을까, 또 있다면 어떻게 있을까? 등. 우리가 저 유명한 게으름에 대한 권리, 또는 비생산성에 대한 또는 꿈과 환상의 생산에 대한 저 유명한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고 누가 우리에게 응답한다면, 우리는 한 번 더 아주 놀라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그와 반대되는 것을, 그리고 욕망적 생산은 현실적인 것을 생산한다는 것을, 또 욕망은 환상 및 꿈과 아무 상관도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했기 때문이다. p.625-626
그녀는 사회 기계, 기술 기계, 욕망 기계가 긴밀하게 합치해서 서로의 체제를 소통시키는 지점을 표시하고 있다. 그녀는 이 사회가 그럴 능력이 있는지, 또 그럴 능력이 없다면 이 사회가 무슨 가치가 있는지 묻고 있다. 그리고 사회 기계들, 기술 기계들, 과학 기계들, 예술 기계들이 혁명적일 때, 이 기계들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즉 이 기계들이 자기 고유의 체제 속에서 이미 그 지표로서 있는 욕망 기계들을 형성하는 것, 이와 동시에 욕망 기계들이 자신의 것이자 욕망의 정립과도 같은 체제 속에서 이 기계들을 형성하는 것. p.626-627
우리는 이와 반대로 처음부터 도구와 기계 사이에 본성의 차이를 정립해야 한다고 믿는다. 도구는 접촉의 담당자이고, 기계는 소통의 요인이다. 도구는 투사적이고, 기계는 회귀적이다. 도구는 가능과 불가능에 관계하고, 기계는 덜 개연적인 것의 확률에 관계한다. 도구는 전체의 기능적 종합에 의해 작동하고, 기계는 하나의 집합체 속에서의 현실적 구별에 의해 작동한다. 어떤 것과 더불어 부품을 이룬다는 것은 자기를 확장하거나 투사하거나 자기를 대체하는 것(소통이 없는 경우)과는 아주 다르다. 피에르 오제는, 아무리 덜 개연적이더라도 가능성은 있는 하나의 체계에서 현실적으로 구별되는 외부 세계의 두 부분 간에 소통이 생기자마자 기계도 생긴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 우리는 또한, 도구에 선행하는 기계가 언제나 있다고, 즉 특정 순간에 어느 도구들, 어느 인간들이 해당 사회 체계 속에 기계 부품으로 들어가는지를 규정하는 문들이 언제나 있다고 믿는다.
욕망 기계들은 환상이라는 형식의 상상적 투사도 아니고 도구라는 형식의 현실적 투사도 아니다. 투사의 체계 전체는 기계에서 파생하지, 그 역이 아니다. 그렇다면 욕망 기계를 일종의 내입으로, 기계의 어떤 변태적 사용으로 정의해야 할까? 전화망의 비밀스러운 예를 들어 보자. 번호가 없어서 자동 응답기에 연결된 번호를 호출하면 북적대는 소리들이 중첩되어 들리는데, 이 소리들은 서로 부르거나, 응하고, 교차되고, 꺼지며, 자동 응답기 내부에서 위로 아래로 빠르고 단조로운 코드들을 따라 언표된 아주 짧은 메시지들이 지나간다. 전화망에는 호랑이가 있다고, 심지어 오이디푸스 같은 사람이 있다고들 말한다. 소년들이 소녀들을 불러내고, 소년들이 소년들을 불러낸다. 거기서 변태적, 인공적 사회들 또는 미지의 사회 형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재영토화 과정이 기계에 의해 보증된 탈영토화 운동에 접목되어 있다. 공공 기관들이, 간섭 현상들 속에서, 기계의 사적 사용이 지닌 이 2차적 이익들에 대해 아무런 장애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동시에 집단적인 것일지언정 단순한 변태적 주관성보다도 더한 무언가가 있다. 정상적인 전화가 소통 기계가 되려 해도 소용없다. 그것은 기계의 특정 부분으로 작동하지 않는 소리들을 투사하거나 확장하는 데 사용되는 한, 하나의 도구로 기능한다. 하지만 여기서 소리들이 기계와 더불어 부품을 이루고, 자동 응답기에 의해 무작위 방식으로 분배되고 분담되는 기계 부품들이 되는 한, 소통은 최고 단계에 도달한다. 가장 덜 개연적인 것이 소멸되는 목소리들의 집합의 엔트로피를 기반으로 해서 구성된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사회/기술 기계의 변태적 사용 내지 적용이 있을 분 아니라 참된 객관적 욕망 기계의 중첩이, 즉 사회/기술 기계 한가운데서 욕망 기계의 구성이 있기도 한 것이다. 이렇게 욕망 기계들이 한 사회의 인공적 여백에서 탄생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이 기계들은 완전히 다르게 발전하고 탄생할 때의 형식들과 안 닮았지만 말이다.
이 전화망 현상을 주석하면서 장 나달은 이렇게 적는다. <그것은 내가 알고 잇는 것 중에서 가장 성공하고 가장 완전한 욕망 기계라고 믿는다. 그것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거기서 욕망은 우연과 다양체 속에서, 부분대상으로서 목소리의 에로틱한 요인 위에서 자유로이 기능하며, 망상 내지 표류의 비제한적 전파를 가로질러, 소통의 사회장의 집합을 사방으로 퍼뜨리는 하나의 흐름에 가지를 뻗는다.> 이 주석가가 전적으로 옳은 건 아니다. 더 좋고 더 완벽한 욕망 기계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변태 기계들은 일반적으로, 주관적 적응, 즉 사회/기술 기계의 개조와 욕망 기계의 객관적 창설 사이의 부단한 변동을 우리에게 제시한다는 이점이 있다. 만일 당신들이 공화국 시민이고자 한다면 한 번 더 노력하라...... 미셸 드 뮈장은 마조히즘에 관해 쓴 가장 훌륭한 텍스트들 중 하나에서, 어떻게 본래의 의미에서 기계인 마조히스트의 변태 기계들이 환상이나 상상의 견지에서 이해될 수 없고 또한 오이디푸스나 거세에서 출발해 투사의 길을 통해서 설명되지 않는지를 밝혀 준다. 그는 말하기를, 환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이, 즉 <오이디푸스적 문제틀 밖에서 본질적으로 구조화된> 프로그램화가 있다. (결국 정신분석 속에 있는 약간의 맑은 공기, 변태들에 대한 약간의 이해로다). p.634-637
욕망 기계들을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모든 방햐에서 또 모든 방면에서 무한히 연결할 수 있는 그것들의 능력이다. 바로 이 때문에 욕망 기계들은 여러 구조를 동시에 가로지르고 지배하는 기계이다. 왜냐하면 기계는 다음 두 성격 내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는 연속된 것의 권력, 즉 기계 문이요, 여기서 특정 부품은 다른 부품과 연결되는데, 증기기관의 실린더와 피스톤이 그렇고, 또는 더 멀리까지 가서 배아 가계에 따르면 기관차의 바퀴도 그렇다. 또한 방향의 급변도 있는데, 이것은 증기기관에 대해 가스 모터가 갖는 관계처럼, 각 기계가 자신이 대체하는 기계에 대해 절대적 절단인 것과 같은 식의 돌연변이이다. 이 두 권력은 하나를 이룬다. 왜냐하면 기계는 그 자체로 흐름-절단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절단은 언제나 한 흐름의 연속성에 인접해 있으며, 이 흐름에 하나의 코드를 줌으로써, 이 흐름이 이런저런 요소들을 운반하게 함으로써, 이 흐름을 다른 흐름들과 떼어 놓는다. p.638-639
기계의 유도적 가치 또는 차라리 변환적 가치는 재귀를 정의하며 투사-재현에 대립된다. 오이디푸스적 투사에 맞선 기계적 회귀는 투쟁 및 분리의 장소이다. p.639
때로는 피카비아처럼 추상적인 것의 발견이 기계적 요소들에 이르는 일이 생기고, 때로는 많은 미래파 사람들처럼 그 반대의 길을 가는 일이 생긴다. 재현적 상태들과 아무것도 재현하지 않는 정감적 상태들 사이에 철학자들이 설정한 오래된 구별을 생각해 보자. 기계는 정감적 상태이다. 그리고 현대의 기계들이 하나의 지각, 하나의 기억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기계들 자체는 정감적 상태들만을 갖고 있다. p.640
그리고 필경 연상들은 다시 형성되고 두 부품 사이에 다시 갇히지만, 그래도 전기 및 기억과 무관한 욕망의 성격 속에, 욕망의 오이디푸스적 사전 규정들 저족 내지 이쪽에, 욕망을 출현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리 짧더라도 관념해리의 순간을 이용해야 하리라. 그리고 트로스트나 루카는 저 훌륭한 텍스트들에서 바로 이 방향을, 혁명의 무의식을 해방하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이 무의식은 하나의 존재로, 즉 비-오이디푸스적 여자와 남자로 향하는데, 그것은 <자유롭게 기계론적인> 존재, <앞으로 발견해야 할 인간 집단의 투사>, 해석의 신비가 아닌 기능의 신비를 지는 존재, <욕망의 전적으로 세속적인 내공>이다. 이런 의미에서 M.L.F의 지상 목표는 모성애와 거세에 대한 난잡한 열광이 아니라 비-오이디푸스적 여성의 기계적/혁명적 구성 아닐까? p.645
팅겔리에게 현실적 구별의 예술은 재귀 절차로서의 일종의 이탈에 의해 획득되었다. 하나의 기계는 그것이 가로지르는 여러 동시 구조들을 작동한다. 첫째 구조는 자기와 관련해서는 기능적이지 않고 둘째 구조 속에서만 기능적인 요소를 적어도 하나는 포함하고 있다. 팅겔리가 본질적으로 유쾌한 것이라고 제시하는 이 놀이야말로 기계의 탈영토화 과정 그리고 가장 탈영토화된 부분으로서 기계공의 위치를 보장한다. p.647
욕망 기계들은 우리 머리에, 우리 상상 속에 있지 않다. 그것들은 사회/기술 기계들 자체 속에 있다. 우리는 기계의 뇌 아버지도 아니고 기계의 훈련된 아들도 아니다. 기계들과 우리의 관계는 서식의 관계이다. 우리는 욕망 기계들을 사회/기술 기계들 속에 서식시킨다. 달리 할 수는 없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사회/기술 기계들은 역사적으로 규정된 그램분자적 조건에서 욕망 기계들의 결집들일 뿐이며, 동시에 욕망 기계들은 그 규정적/분자적 조건으로 되돌려진 사회/기술 기계들이라고. 슈비터스의 '메르츠'는 '코메르츠'(상업은행)의 마지막 음절이다. 이 욕망 기계들의 유용성 내지 무용성, 가능성 내지 불가능성을 묻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다. 불가능성(또한 드물긴 하지만), 무용성(또한 드물긴 하지만)은 자율적인 예술적 제시 안에서만 나타난다. 욕망 기계들이 있고, 어떻든 여기 있고, 우리가 그것들과 더불어 기능하고 있으니, 그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이 당신은 보이지 않는가. 욕망 기계들은 탁월하게 유용하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두 방향에서 기계와 인간의 관계, 이 둘의 소통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기계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당신은 당신 자신이 이 부품들 중 하나로서 그 기계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못 보고 있다. 기꼐가 이미 작동하기 위해서는 결핍되어 있다고 당신이 여겼던 바로 그 부품을, 즉 무용가-위험을. 당신은 가능성 내지 유용성을 따지고 있지만, 당신은 이미 기계 속에 있고, 기계의 부분을 이루고 있고, 기계 속에 손가락, 눈, 항문 또는 간을 넣어 버렸다(<당신 말려들었어......>의 현실 판). p.650
큰 기계들은 자본주의 내지 전제군주 유형의 생산관계들을 내포하며, 소비자나 사용자의 상태로 환원된 사람들의 의존, 착취, 무력을 야기한다. 생산수단의 공동소유는 이 사태를 조금도 바꾸지 않고 그저 스탈린적 전제군주 조직을 부양할 따름이다. 또 일리치는 그것을 <회식 사회>, 말하자면 비-오이디푸스적 욕망적 사회에서 각자가 생산수단을 이용할 권리와 대립시킨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1.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 의한 기계들의 가장 확장된 이용, 2. 작은 기계들의 배가 및 작은 단위들에 큰 기계들이 적응, 3. 생산자-이용자들 자신에 의해 조립되어야 할 기계적 요소들의 배타적 판매, 4. 지식의 전문화나 직업의 독점 파괴등. 의학 지식 대부분의 독점 내지 전문화, 자동차 모터의 복잡화, 기계들의 거대화 등 서로 아주 다른 것들이 기술의 필요에 응하는 것이 전혀 아니고, 권력이나 통제력을 지배계급의 수중에 집중할 작정인 경제적/정치적 지상명령에 응하는 것일 분이라는 점은 아주 명백하다. 도시에서 자동차가 근본적으로 기계적 무용성을 갖는다는 점, 내보이기 위한 기발한 물품들을 장착하고는 있어도 자동차는 구태의연한 성격을 갖는다는 점, 자전거가 베트남전쟁 못지않게 우리 도시에서도 현대적 가능성을 갖는다는 점 등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은 자연으로의 회귀를 꿈꾸는 것이 아니다. 욕망적 <회식 혁명>은,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작은 기계들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자본주의 내지 공산주의 사회들이 경제적/정치적 권력과 관련하여 전력을 다해 억압하는 기계적 혁신 자체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p.651
사실, 기계들의 환원 내지 적응이라는 주제는 그 자체로는 충분치 않고, 가령 모두가 기계들을 이용하고 제어하겠다는 요구가 보여 주듯, 다른 뭔가를 위해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사회/기술 기계들과 욕망 기계들 간의 참된 차이는 분명 크기에 있지도 않고 목적들에 있지도 않으며, 다만 크기와 목적들을 결정하는 체제에 있기 때문이다. 이 둘은 같은 기계지만, 체제는 같지 않다. 기술을 압제적인 경제와 정치에 맞추게 하는 현행 체제에, 기술이 해방되고 또 해방적이리라 할 수 있을 어떤 체제를 대립시켜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기술은 사회 기계들과 욕망 기계들이 서로 상대방 안에 있다고 전제하며, 그 자체로는 어느 것이 기계화하는 심급인지를, 욕망인지 욕망의 압제인지를 결정할 어떤 권능도 없다. 기술이 자신에 의해서 작용한다고 우길 때마다, 기술은 기술-구조에서처럼, 파시스트 색채를 띠게 된다. 왜냐하면 기술은 경제적/정치적 투자들만이 아니라 리비도 투자들도 똑같이 내포하고 있는데, 이 투자들은 온통 욕망의 압제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욕망의 체제와 욕망의 체제 같은 두 체제의 구별은 집합체와 개체의 구별로 귀착되는 것이 아니라 두 유형의 군중 조직으로 귀착되며, 각 유형에서 개인과 집단은 똑같은 관계를 맺지 않는다. 이 두 유형 간에는 거시 물리학과 미시 물리학에서와 똑같은 차이가 있다. 물론 여기서, 미시 물리학의 심급은 기계-전자가 아니라 기계화하는 분자적 욕망이며, 마찬가지로 거시 물리학의 심급은 그램분자적인 기술적 대상이 아니라 반-욕망적/반생산적인 그램분자화하는 사회구조로, 이 사회구조가 기술적 대상들의 사용, 제어, 소유를 현행적으로 조건 짓고 있다. 우리 사회의 현행 체제에서, 욕망 기계는 변태적인 것으로서만, 말하자면 기계들의 진지한 사용의 여백에서만, 또한 사용자들, 생산자들, 또는 반생산자들의 차마 말할 수 없는 2차적 이익으로서만 용인되고 있다. 하지만 욕망 기계의 체제는 일반화된 변태가 아니라, 차라리 그 반대이며, 결국은 행복해진 일반적이고 생산적인 분열증이다. 왜냐하면 욕망 기계에 대해서는 팅겔리처럼 이렇게 말해야 하기 때문이다. 참으로 기쁨에 찬 기계, 기쁨에 찼다는 말은 내겐 자유롭다는 뜻이다.
3 기계와 충만한 몸 - 기계의 투자들
자세한 부분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자마자, 생산력과 생산관계에 관한 맑스의 테제들보다 더 모호한 것도 없다. 대체로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한다. 도구들부터 기계들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생산수단은 사회적 생산관계들을 내포하지만, 이 생산관계들은 생산수단 외부에 있고, 생산수단은 생산관계들의 지표일 뿐이라고. 하지만 <지표>란 무엇을 뜻할까? 기계는 도구에서 출발해 파악되고 도구는 유기체 및 그 필요들과 관련하여 파악되는 식으로, 왜 인간과 자연의 고립된 관계를 재현한다고 추정되는 추상적인 진화 계통을 투사했을까? 이렇게 되면 사회관계들은 도구나 기계 외부에 있다고 보이게끔 되며, 이종적 사회조직들에 따르는 진화 계통을 부숨으로써 도구나 기계에 또 다른 생물학적 도식을 안에서부터 강요하게끔 된다. 반대로 우리가 보기에는, 기계는 한 사회적 몸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생각되어야지, 생물학적 인간 유기체와 관련해서 생각되면 안 된다. 사정이 이렇다면, 추상적 인간에서 자신의 출발점을 찾은 하나의 선 위에서 도구의 절편을 계승하는 새로운 절편으로 기계를 여길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과 도구는 해당 사회의 충만한 몸 위에서 이미 기계 부품들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기계는, 기계화하는 심급으로서 충만한 몸에 의해, 또 이 몸 위에 분배되어 있는 한에서 기계 작동되는 인간들과 도구들에 의해 구성되는 하나의 사회 기계이다.가령 인간-말-활을 기계 작동시키는 스텝이라는 충만한 몸이 있고, 인간들과 무기들을 기계 작동하는 희랍 도시라는 충만한 몸이 있고, 인간들과 기계들을 기계 작동하는 공장이라는 충만한 몸이 있고, 이런 식이다. 우어가 부여했고 맑스가 인용한, 제작소에 대한 두 가지 정의 중에서, 첫째 정의는 기계들을 이것들을 감독하는 인간들과 관련시키고, 둘째 정의는 기계들과 인간들, 즉 <기계적 기관들과 지적 기관들>을 이것들을 기계 작동하는 충만한 몸으로서 제작소와 관련시킨다. 그런데 바로 이 둘째 정의가 있는 그대로 얘기된 구체적인 것이다.
장소들, 공동 설비들, 소통 수단들, 사회적 몸들이 기계들 또는 기계 부품들로 여겨지는 것은 은유에 의해서도 의미 확장에 의해서도 아니다. 반대로, 기계가 하나의 기술적 현실만을 가리키게 되는 것은 의미 제한과 파생을 통해서인데, 이런 일은 바로 하나의 아주 특수한 충만한 몸, 즉 돈-자본의 몸이라는 조건에서만, 이 몸이 도구에 고정자본의 형식을 주고, 즉 도구들을 자율적인 기계적 대표 위에 분배하고, 인간에게 가변자본의 형식을 주는, 즉 인간들을 노동 일반의 추상적 대표 위에 분배하는 한에서 생긴다. 같은 계열에 속하는 충만한 몸들의 접합, 즉 자본의 몸, 공장의 몸, 매커니즘의 몸......(아니면 희랍 도시의 몸, 보병 밀집 부대의 몸, 손잡이가 둘인 방패). 우리는 어떻게 기술 기계가 단순한 도구들을 계승하는지 물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회 기계가, 또 어떤 사회 기계가 인간들과 도구들을 기계 작동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술 기계들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필연적이게끔 하는지 물어야 한다.
이렇게 이해된 기계는 욕망 기계로 정의된다. 그것은 기계 작동하는 충만한 몸과 이 몸 위에서 기계 작동되는 인간들 및 도구들의 집합이다. 여기서 많은 귀결들이 도출되는데, 우리는 이것들을 그저 프로그램으로만 보여 줄 수 있을 뿐이다.
첫째, 욕망 기계들은 정녕 사회/기술 기계들과 같지만, 이것들의 무의식과 같다. 실제로 욕망 기계들은 특정 사회장의 경제, 정치, 기술의 의식적 내지 전의식적 투자들에 상응하는 리비도 투자들을 현시하고 동원한다. 여기서 상응한다는 것은 유사하다는 뜻이 전혀 아니다. 하나의 다른 분배, 하나의 다른 <지도>가 문제이며, 이 분배 내지 지도는 한 사회에서 구성된 이해관계들과도, 가능과 불가능 및 강제와 자유의 할당과도, 즉 한 사회의 근거들을 구성하는 모든 것과 더 이상 관계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근거들 아래에는, 흐름들 자체와 흐름들의 절단들을 투자하며, 이 사회의 기저에서 무작위 요인들, 덜 개연적인 형상들, 독립된 계열들의 만남들을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여러 색다른 형식의 욕망이 있으며, 이 형식들은 <자신에 대한> 하나의 사랑을, 즉 자본 자체에 대한 사랑, 관료제 자체에 대한 사랑, 탄압 자체에 대한 사랑을, <한 자본가가 자신의 바닥에서 욕망하는 것은 무엇일까?> 및 <인간이 타인들에 대해서 뿐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도 탄압을 욕망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등 모든 종류의 이상한 사태를 밝혀낸다.
둘째, 욕망 기계들이 사회/기술 기계들의 내부 극한으로 존재한다는 점은, 한 사회의 충만한 몸, 즉 기계화하는 심급이 결코 그 자체로는 주어지지 않으며 이 사회 안에서 작용하는 항들 및 관계들에서 출발해 항상 추론되어야 한다고 여길 때 더 잘 이해된다. 발아하는 몸으로서의 자본, 즉 돈을 생산하는 돈이라는 충만한 몸은 결코 그 자체로 주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극한으로의 이행을 내포하는데, 이 극한에서 항들은 절대적으로 포착된 단순한 형식들로 환원되고, 관계들은 연줄의 부재로 <정립적으로> 대체된다. 가령 자본주의 욕망 기계를 위해서는 자본과 노동력의 만남, 즉 탈영토화된 부로서의 자본과 탈영토화된 노동자로서의 노동력의 만남이 있는데, 이 둘은 독립된 두 계열 또는 단순한 형식들로 자본주의에서는 이 둘의 무작위적 만남이 끊임없이 재생산된다. 어떻게 연줄의 부재가 <정립적>일 수 있을까? 우리는 욕망의 역설을 언급하는 르클레르의 다음 물음을 발견한다. 어떻게 요소들이 바로 연줄의 부재를 통해 연계될까? 어떤 점에서는, 스피노자나 라이프니츠와 더불어, 데카르트주의가 끊임없이 이 물음에 답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하나의 특유한 논리를 내포하는 것으로서 현실적 구별의 이론이다. 궁극 요소들 내지 단순한 형식들이 동일한 존재나 동일한 실체에 속하는 것은 바로 이것들이 현실적으로 구별되며, 또 서로 전적으로 독립해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실체의 충만한 몸은 결코 하나의 유기체로 기능하지 않는다. 그리고 욕망 기계는 구별되는 요소들 내지 단순한 형식들의 다양체와 다름없다. 또한 이 요소들 내지 단순한 형식들은, 이것들이 한 사회의 충만한 몸 <위에> 있는 한 또는 이것들이 현실적으로 구별되는 한, 이 충만한 몸 위에서 연계되어 있다. 극한을 향한 이행으로서의 욕망 기계. 즉 충만한 몸의 추론, 단순한 형식들의 추출, 연줄의 부재들의 지정. 맑스의 [자본]의 방법은 이 방향으로 가지만, 변증법적 전제들이 하부구조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서의 욕망에까지 도달하는 것을 방해한다. 셋째, 기술 기계 외부에 머물러 있는 생산관계들은 반대로 욕망 기계 내부에 있다. 이는 관계의 자격에서가 아니라 기계 부품이라는 자격에서 참인데, 이 부품의 일부는 생산의 요소들이요 다른 일부는 반생산의 요소들이다. J.-J. 르벨은 감옥의 욕망 기계를 형성하는 주네의 영화 속 이미지들을 인용한다. 인접한 두 독방에 갇힌 두 사람이 있는데, 그중 한 사람이 벽의 작은 구멍에 끼여 있는 빨대를 통해 다른 한 사람의 입 속에 입김을 불어넣고 있고, 한편 간수는 이것을 지켜보면서 자위행위를 한다. 간수는 기계의 반생산의 요소이자 동시에 엿보는 부품이다. 즉 욕망은 모든 부품을 지나간다. 이는 욕망 기계들이 평온하지 않음을 뜻한다. 욕망 기계들에는 지배들과 예속들, 치명적 요소들, 사디즘 부품들과 마조히즘 부품의 중첩이 있다. 바로 욕망 기계에서, 이 부품들 내지 요소들은 다른 모든 부품 내지 요소처럼 고우하게 성적인 차원을 갖고 있다. 오이디푸스 코드는 사회구성체들의 대역을 하고, 또는 심지어 이 구성체들의 정신적 발생과 조직을 주재하는데, 덩신분석이 바라듯 성욕기 이 코드를 이용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성적 상징체계란 없다. 그리고 성욕은 하나의 다른 <경제>, 하나의 다른 <정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정치경제학 자체의 리비도적 무의식을 가리킨다. 욕망 기계의 에너지인 리비도는 계급, 인종 등 모든 사회적 차이를 성적인 것으로서 투자한다. 무의식 안에서 성적 차이의 벽을 보장하기 위해서건, 반대로 이 벽을 폭파하여, 비-인간적 성 속에서 이 벽을 소멸시키기 위해서건 말이다. 욕망 기계는, 자신의 폭력 속에서, 욕망에 의한 사회장 전체의 시험, 즉 욕망의 승리로 끝날 수도 욕망의 압제의 승리로 끝날 수도 있는 시험이다. 그 시험은 다음과 같은 점에 있다. 즉 하나의 욕망 기계가 주어질 때, 어떻게 이 기계는 생산관계나 사회적 차이를 자기 부품들의 하나로 만들며, 또 이 부품의 위치는 어디일까? 골드버그의 그림 속 억만장자의 배, 주네의 이미지에서 자위하는 간수는? 감금된 사장은 공장이라는 욕망 기계의 한 부품, 시험에 응하는 한 방식이 아닐까?
넷째, 무의식의 에너지로서의 성욕이 욕망 기계들을 통한 사회장의 투자라면, 기계들 일반을 대면하는 태도는 결코 하나의 단순한 이데올로기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부구조 자체 속 욕망의 정립, 즉 사회장을 가로지르는 절단들과 흐름들과 관련한 욕망의 돌연변이들을 표현하는 것 같다. 바로 이런 가닭에 기계라는 주제는 아주 강하게, 아주 공공연하게 성적인 내용을 갖는다. 1차 세계대전을 전후해서 기계를 둘러싸고 네 가지 커다란 태도가 대결하고 있었다. 1. 이탈리아 미래파의 그램분자적인 큰 열광은 국가의 생산력을 발전시켜 새로운 국민을 생산하게 하기 위해 기계에 기대를 거는데, 생산관계는 문제 삼지 않는다. 2. 러시아 미래파와 구성주의의 태도는 집단 전유에 의해 정의되는 새로운 생산관계와 관련하여 기계를 생각한다.(타틀린이나 모호이너지의 탑-기계는 민주 집중제라는 저 유명한 당 조직, 즉 정점, 전달 벨트, 저변을 갖춘 나선형 모델을 표현한다. 생산관계들은 <지표>로 기능하는 기계 외부에 계속 존재한다). 3. 다다이즘의 분자적 기계장치는 그 나름대로 욕맘ㅇ 혁명으로서의 전복을 수행한다. 이는 그것이 생산관계들을 욕망 기계의 부품들의 시험에 들게 하고, 국가와 등의 모든 영토성 너머에서 이 욕망 기계로부터 기쁜 탈영토화 운동을 끌어내기 때문이다. 4. 끝으로 휴머니즘의 반-기계주의는 상상적 내지 상징적 욕망을 구해 내고 이 욕망을 다시 기계에 맞서게 하려 하는데, 이를 위해 욕망을 오이디푸스 장치로 복귀시키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다다이즘에 맞선 초현실주의 또는 다다이스트 버스터 키튼에 맞선 채플린).
그리고 이데올로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 시기와 집단의 무의식 전체를 작동하는 기계화가 바로 문제이기 때문에, 이 태도들이 사회/정치장과 맺는 연줄은 규정되지 않은 것은 아니나 복합적이다. 이탈리아 미래파는 파시스트적 욕망 기계의 조직의 조건들 및 형식들을 잘 표현하고 있지만, 또한 국가주의적/호전적 <좌파>의 모든 애매함도 지니고 있다. 러시아 미래파들은 자신들의 무정부주의적 요소들을 부수는 당의 끼계 속으로 이 요소들을 미끄러져 들어가게 하려 한다. 정치는 다다이스트들의 장기가 아니다. 휴머니스트는 욕망 기계들의 투자 철회를 수행하지만, 이 기계들은 휴머니즘 속에서 여전히 계속 기능한다. 하지만 이 태도들을 둘러싸고 욕망 자체, 욕망의 정립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말하자면, 욕망 기계들과 사회/기술 기계들 간에, 한편에선 욕망이 파시스트적/편집증적 구성체들을 투자하고 반대로 다른 한편에선 분열증적/혁명적 흐름들을 투자하는 이 두 극단적 극 간에, 각각의 내재성의 관계라는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욕망의 역설은, 이 극들을 풀어내고 욕망 기계들을 위해 집단의 혁명적 시험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이토록 긴 분석을, 무의식 분석을 전부 해야 한다는 점이다. p.652-660
'스토아주의'의 오류는 자연법칙의 반복을 기대한다는 데 있다. 지혜로운 자는 덕이 있는 자로 바뀌어야 한다. 반복을 가능케 할 법칙을 발견하고자 하는 꿈은 도덕법칙의 영역으로 자리를 옮긴다. 의무의 재천명과 구별할 수 없는 일상생활에는 항상 다시 시작해야 할 어떤 과제가 잇고 다시 되풀이해야 할 어떤 신의가 있다. 뷔흐너의 당통은 이렇게 말한다. "먼저 윗옷을, 그다음 바지를 꿰입는 것, 저녁마다 침대 안응로 기어들었다 아침마다 다시 밖으로 기어 나오는 것, 그리고 항상 한 발을 다른 한 발 앞에 디디면서 걷는다는 것은 얼마나 진절머리 나는 일인가. 이런 일들이 언젠가 변하리란 희망은 거의 없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처럼 해왔고 앞으로 다른 수백만의 사람들도 여전히 똑같이 할 것이다. 게다가 우리는 같은 일을 하는 똑같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두 번 이루어진다. 이 모든 것은 얼마나 지겹고 슬픈 일인가." 그러나 만일 도덕법칙이 되풀이를 신성시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무엇보다 되풀이를 가능케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자연법칙이 박탈해간 입법 능력을 다시 우리에게 되돌려 주지 않는다면, 도덕법칙은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때때로 도덕주의자들이 선과 악을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서술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자연에 속한 존재자로서 우리는 자연적 본성에 따라 반복(쾌락, 과거, 정념 등의 반복)을 꾀한다. 그러나 그때마다 번번이 절망이나 권태밖에 출구가 없는 어떤 악마적인 그리고 이미 저주받은 시도 속에 빠지고 만다. 거꾸로 선은 우리에게 반복의 가능성, 반복의 성공 가능성과 정신성을 선물할 것이다. 왜냐하면 선이 어떤 법칙에 의존한다면, 이 법칙은 더 이상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 의무의 법칙에 해당할 것이기 때문이며, 우리가 도덕적 존재자로서 입법적 주체가 되지 않고는 그 법칙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칸트가 최고의 시험이라 불렀던 것은 어떤 사유의 시험이 아니라면 또 무엇이란 말인가? 그것은 권리상 재생산될 수 있는 것을, 다시 말해서 도덕법칙의 형식 안에서 모순 없이 반복될 수 있는 것을 규정해야 하는 사유의 시험이다. 의무의 인간은 반복의 '시험을 고안해냈고, 반복될 수 있는 것을 권리의 관점에서 규정했다. 따라서 의무의 인간은 악마적인 것과 동시에 지겨울 정도로 판에 박힌 것을 다 같이 극복했다고 믿는다. 게다가 당통의 근심들에 대한 한 가지 반향과 그 응답이 도덕주의일 수 있다. 칸트가 스스로 제작했다는 놀라운 양말대님에조차, 가령 매일의 고정적인 산책 시간들같이 칸트의 전기 작가들이 그토록 정확하게 기술했던 반복 장치들에조차 어떤 도덕주의가 놓여 있는 것이 아닐까?(몸단장을 무시하고 버르장머리가 없다는 것이 어떤 격률을 따르는 행동들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물을 수 있다. 이런 행동들이 따르는 격률들은 모순 없이는 보편적 법칙으로 생각될 수 없고 그러므로 권리상 반복의 대상도 될 수 없다.)
반복, 자연법칙, 도덕법칙
그러나 양심의 애매성은 바로 다음과 같은 점에 있다. 먼저 양심은 오로지 자연법칙에 외면적이고 자연법칙보다 우월하며 자연법칙에 무관심한 도덕법칙을 정립할 때에만 생각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 양심은 그 자신 안에서 자연법칙ㅇ츼 이미지와 모델을 되살릴 때에만 도덕법칙의 적용을 생각할 수 있다. 그 결과 ㅗ떡법칙을 통해 우리는 참된 반복에 도달하기는 커녕 여전히 일반성에 매몰되어버린다. 여기서 일반성은 이제 더 이상 자연의 일관성이 아니다. 그것은 제 2의 자연에 해당하는 습관의 일반성이다. 여기서 현존하는 부도덕한 습관이나 악습들을 내세워봐야 헛된 일이다. 본질적으로 도덕적인 것, 선의 형상을 띠는 것은 습관의 형식이다. 달리 말해서 그것은 베르그손이 말했듯이 어떤 습관들(의무의 전부)을 가지려는 습관이다. 그런데 이 모든 습관 또는 이 모든 습관적 일반성 안에서 우리는 다시 두 개의 커다란 질서를 발견한다. 첫째, 유사상들의 질서. 이 질서는 습관이 확립되지 않았을 때 어떤 가정된 모델에 비추어 행위요소들이 보여주는 가변적인 일치 속에서 형성된다. 둘째, 등가성들의 질서. 이 질서는 습관을 획득한 이후 상이한 상황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 요소들 간의 동등성과 더불어 형성된다. 둘째, 등가성들의 질서. 이 질서는 습관을 획득한 이후 상이한 상황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 요소들 간의 동등성과 더불어 형성된다. 그 결과 어떤 습관도 결코 참된 반복을 형성하지 못한다. 전자의 경우 의도는 변하지 않으면서 단지 행동만이 변하고 완전성을 띠어간다. 후자의 경우에는 행동이 동등하게 남아 있으면서 서로 다른 의도와 문맥들 속에 놓인다. 여기서 반복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완전성과 통합성이라는 두 일반성 사이에서만, 그리고 그 두 일반성 아래에서만 나타난다. 하지만 그렇게 나타나는 반복은 그 두 일반성을 전복할지도 모르는 위험을 수반하면서 전혀 다른 종류의 역량을 증언하고 있다.
만일 반복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자연법칙에 반하는 만큼이나 도덕법칙에 반하여 성립한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도덕법칙을 전복하는 데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원리들로 향하는 상승의 길이다. 여기서 법칙의 질서는 이차적이고 파생적인 질서로, 차용된 질서이자 '일반적인' 질서로 부인된다. 법칙 안에서 비난받는 것은 어떤 본연의 힘을 우회시키고 어떤 원천적인 역량을 참칭하는 이차적인 원리이다. 다른 하나는 거꾸로 하강의 길이다. 법칙은 그 귀결들로 내려갈수록, 과도할 정도로 완벽한 세심함을 기울여 복종할수록 전복되기 쉽다. 허위로 복종하는 영혼이 법칙을 회피할 수 있고 법칙이 금지하는 것으로 간주된 쾌락들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법칙을 그대로 따른 덕분이다 이것은 모든 귀류법적 논증들에서, 또 절차를 어김없이 지킴으로써 마비 효과를 가져오는 준법 파업들에서 볼 수 있다. 게다가 이것은 철저한 복종을 통해 조롱의 효과를 낳는 마조히스트의 행동들 속에서도 볼 수 있다. 법칙을 전도시키는 첫 번째 방식은 반어ironie이다. 반어는 원리들의 기술, 원리들을 향한 상승의 기술, 원리 전도의 기술로서 등장한다. 두 번째 방식은 익살이다. 이것은 귀결들을 이끌어내는 기술이자 하강의 기술, 계류의 기술이자 추락의 기술이다. 반복이 이런 상승 못지않게 계류에서 솟아난다면, 이는 마치 실존이 더 이상 법칙들에 의해 구속되지 않게 되자마자 그 자체로 다시 시작되고 '되풀이되는' 것인 양 이해되어야 하는 것일까? 반복은 익살과 반어에 속하는 사태이다. 반복은 본성상 위반이고 예외이다. 반복은 언제나 법칙에 종속된 특수자들에 반하여 어떤 독특성을 드러내며, 법칙을 만드는 일반성들에 반하여 항상 어떤 보편자를 드러낸다.
질 들뢰즈, <차이와 반복>, p.29-32
욥은 반어적인 방법으로 법률을 문제 삼고 모든 간접적 형태의 설명을 거부하며 일반적인 것을 퇴출시킨다. 그리고 마침내 원리의 자격과 보편성을 지니는 가장 독특한 것에 도달한다. 아브라함은 해학적으로 법칙에 굴복하지만, 정확히 바로 이 굴복 안에서 법률이 제물로 요구했던 외아들의 독특성을 찾아낸다.
반복을 습관의 일반성들뿐 아니라 기억의 특수성들에 대립시키기. 왜냐하면 외부로부터 응시된 어떤 반복에서 새로운 어떤 것을 '훔쳐내는' 데 이르는 것은 아마도 습관일 것이기 때문이다. 슴관 안에서 우리는 단지 우리 속에 어떤 응시하는 작은 자아가 있다는 조건에서만 행동한다. 특수한 경우들의 사이비 반복으로부터 새로운 것, 곧 일반적인 것을 추출해내는 것은 이런 작은 자아이다. 또 기억은 일반성 속에 용해된 특수자들을 다시 발견해내는 것인지 모른다. 하지만 이런 심리학적 운동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니체와 키에르케고르에게서 이 운동들은 습관과 기억을 다같이 배척하는 반복 앞에서 사라진다. 반복이 미래의 사상인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즉 반복은 상기라는 고전적 범주에, 그리고 하비투스라는 근대적 범주에 대립하는 위치에 있다. 반복 안에서, 그리고 반복을 통해 비로소 망각은 어떤 실증적 역량이 되고 무의식은 어떤 실증적이고 월등한 무의식이 된다. (가령 힘으로서의 망각은 영원회귀의 체험을 구성하는 일부이다.) 모든 것은 역량 안에서 하나로 집약된다. 키에르케고르가 반복을 의식의 이차적 역량이라 할 때, '이차적'이란 말은 두 번째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한 번을 통해 자신을 언명하는 무한자, 한 순간을 통해 자신을 언명하는 영원, 의식을 통해 자신을 언명하는 무의식, 'n승'의 역량을 의미한다. 그리고 니체가 영원회귀를 힘의 의지에 대한 무매개적인 표현으로 제시했을 때, 이 의지는 결코 '역량을 의욕한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무엇을 의지하든지 간에 의지하는 바의 것을 '거듭제곱'의 역량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서 역량의 우월한 형식을 끌어내라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영원회귀를 통해 실행되는 사유의 선별적 작용에, 그리고 영원회귀 자체가 보여주는 반복의 독특성에 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의 우월한 형식, 바로 여기에 영원회귀와 초인의 직접적 동일성이 있다. *주 - 이하의 논의는 이 책 2장 전반부에서 상세히 펼쳐지는 습관(하비투스)의 반복(첫 번째 수동적 종합), 순수 과거(므네모시네)의 반복(두 번째 시간의 종합), 죽음본능(무의식)의 반복(세번째 시간의 종합) 등에 대한 논의를 전제한다. 들뢰즈적 의미의 습관은, 계속 이어지되 서로 독립해 있는 요소와 경우들(순간들)을 수축해서 살아있는 현재를 구성하는 능력이며, 습관의 이런 수축 능력은 응시의 수동적 종합 능력으로 정의된다. 이때 응시의 본질은 반복되는 요소나 경우들에서 전혀 새로운 어떤 것, 곧 차이를 훔쳐내는 데 있다. 들뢰즈적 의미의 (작은) 자아는 언제나 응시하는 자아, 순간들의 반복에서 차이(살아있는 생생한 현재)를 훔쳐내는 정신이다. 이 대목에서 들뢰즈는 키에르케고르와 니체의 반복이 자신이 말하는 세 번째 반복의 사례들임을 미리 암시하고 있는 셈이다. p.37-38
개념의 내포와 '봉쇄' 현상
그렇지만 하나의 개념은 항상 규정들 각각의 수준에서, 자신이 내포하는 술어들 각각의 수준에서 봉쇄될 수 있다. 규정으로서의 술어는 개념 안에서는 고정되어 있지만 사물 안에서는 얼마든지 다른 것으로 변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동물'은 인간과 말에게서 각기 다른 것이 되고, '인간됨'도 피에르와 폴에게서는 다른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의 내포는 무한하다. 즉 사물 안에서 달라지고 난 술어는 개념 안에서는 어떤 다른 술어의 대상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그러나 또한 마찬가지의 이유에서 각각의 규정은 일반적인 것으로 남아 있거나 어떤 유사성을 정의한다. 개념 안에 고정되어 있으면서 권리상 무한히 많은 사물들에 합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념의 내포는 실재적 사용에서는 무한으로 나아가지만, 그 논리적 사용에서는 항상 어떤 인위적 봉쇄에 직면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개념의 내포에 대한 모든 논리적 제한은 1보다 큰 외연, 권리상 무한한 외연을 가져온다. 그리고 마침내 실존하는 어떠한 개체도 지금 여기서 대응할 수 없는 어떤 일반성을 가져온다(내포와 외연의 반비례 규칙). 그래서 차이-개념 안의 차이에 해당하는 차이-의 원리는 유사성들의 포착을 금지하지 않는다. 오히려 거꾸로 그것들에 가장 지극한 유희를 허락한다. 이미 수수께끼 놀이의 수준에서 말하더라도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는 물음은 항상 "어떤 유사성이 있는가?"라는 물음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분류에서 종들에 대한 규정은 유사성들에 대한 어떤 연속적인 평가를 함축하고 가정한다. 어쩌면 유사성은 어떤 부분적인 동일성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유는 간단하다. 개념 안의 술어는 사물 안에서는 다른 것으로 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술어는 이 사물의 한 부분이 아니다. p.47-48
이산적 외연이라는 이 현상은 개념의 자연적 봉쇄를 함축하는데, 이 봉쇄는 논리적 봉쇄와는 다른 본성을 지닌다. 즉 그것은 사유 안에 유사성의 질서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실존 안에서 어떤 참된 반복을 형성한다. 항상 개념의 어떤 논리적 역량을 지칭하는 일반성, 그리고 개념의 무능력이나 실재적 한계를 증언하는 반복, 이 둘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반복, 그것은 이처럼 실존으로 이행하도록 강요되고 유한한 내포를 갖는 개념의 순수한 사실인 것이다. p.49
즉 시간과 공간은 그 자체가 어떤 반복 매체들이다. 그리고 실재적 대립은 어떤 최대의 차이가 아니라 오히려 어떤 최소의 반복이다. 그것은 자신으로 복귀하고 자신의 반향을 만들면서 둘로 환원되는 하나의 반복, 자신을 정의하는 수단을 발견한 어떤 반복이다. 따라서 반복은 개념 없는 차이로, 무한정 이어지는 개념적 차이에서 벗어나는 차이로 나타난다. 반복은 실존하는 존재자의 어떤 고유한 역량을 드러낸다. 반복은 개념을 통한 모든 종별화 - 이것이 아무리 멀리까지 이어지는 종별화라 해도- 에 저항하는, 직관 속에 끈덕지게 실존하는 존재자의 고집을 표현한다. 칸트는 이렇게 말한다. 개념 안에서 아무리 멀리 나아간다 해도 당신은 늘 반복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그 개념에 복수의 대상이, 적어도 두 대상이 대응하도록 만들 수 있다. 가령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더한 쪽에 하나 덜한 쪽에 하나, 적극적인 쪽에 하나 부정적인 쪽에 하나가 대응하도록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만일 무한정한 내포를 갖는 개념들이 자연의 개념들이라 간주한다면, 이런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무한정한 내포를 지니는 한에서 자연의 개념들은 항상 다른 사물 안에 있게 된다. 즉 그 개념들은 자연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응시하거나 관찰하는 정신 안에, 스스로 자연을 표상하는 정신 안에 있게 된다. 자연이 외면화된 개념이라거나 자기 자신과 대립하는 소외된 정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이다. 이런 종류의 개념들에 대응하는 대상들은 그 자체가 기억을 결여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안에 자신의 고유한 계기들을 지니거나 모으지 않는다. 자연은 왜 반복하는 것일까? 그것은 자연이 '부분 밖의 부분, 일시적 정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로움은 스스로 표상하는 정신의 편에 속하게 된다. 즉 정신은 기억을 지니거나 습관들을 취하기 때문에 어떤 개념들 일반을 형성하고 무언가 새로운 것을 끄집어낼 수 있다. 기억과 습관들 덕분에 정신은 자신이 응시하는 반복으로부터 새로운 어떤 것을 훔쳐낼 수 있는 것이다. 유한한 내포를 지닌 개념들은 명목적 개념들이다. 무한정한 내포를 지니지만 기억을 결여한 개념들은 자연의 개념들이다. 그런데 이 두 경우 모두를 통해 길어낼 수 없는 자연적 봉쇄의 사례들이 아직 남아 있다. 가령 무한한 내포를 지니고 기억을 갖추었으나 자기의식을 결여한 어떤 개별적 기초개념이나 특수한 표상이 있다. 표상이 총괄하는 내용은 물론 즉자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그 안에는 기억내용도 들어 있다. 이 기억내용은 여기서 모든 낱낱의 특수한 행동, 장면, 사건, 존재자 전체를 끌어안고 있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자연적인 이유 때문에 결핍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의식의 대자적 차원이자 재인의 차원이다. 기억이 결여하고 있는 것, 그것은 재기억이거나 오히려 차라리 철저한 되새김이다. 의식은 표상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를 설정한다. 이 관계는 "나는 어떤 표상을 떠올린다."라는 표현에서 나타나는 관계보다 훨씬 심층적이다. 의식이 표상을 나에게 연관짓는다면, 이때 나는 어떤 자유로운 인식능력이며 그래서 어떠한 자신의 생산물에 의해서도 구속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자유로운 능력에 대해 각각의 생산물은 이미 사유되어 있고 과거로서 재인되어 있으며, 말하자면 내감 안에서 일어나는 특정한 변화의 기회로 간주된다. 의식이 앎을 결여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철저한 되새김을 결여할 때, 즉자적 상태의 앎은 대상의 반복에 불과하다. 앎은 연기된다. 다시 말해서 앎은 인식되는 대신 반복되고 행동으로 옮겨진다. 반복은 여기서 자유로운 개념의 무의식, 앎이나 기억내용의 무의식, 표상의 무의식으로 드러난다. 이런 봉쇄에 자연스러운 설명이유를 마련해준 것은 프로이트였다. 그 이유는 억압과 저항에 있다. 이 억압과 저항에 의해 반복 자체는 어떤 진정한 '강제', '강박'이 된다. 따라서 기것을 세 번째 경우의 봉쇄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봉쇄는 자유의 개념들과 연관되어 있다. 또한 특정한 프로이트주의적 관점에서 보자면, 여기서 반복과 의식, 반복과 재기억, 반복과 재인 사이에 반비례 관계의 원리를 끌어낼 수 있다('무덤들' 혹은 매장된 대상들의 역설). 즉 더 적게 회상하고 더 적게 의식할수록 과거는 그만큼 더 많이 반복된다 - 반복하지 않으려면 회상하시오, 기억을 철저히 되새기시오. 재인 안의 자기의식은 미래의 인식능력이나 미래의 인식능력이나 미래의 기능으로, 새로운 것의 기능으로 나타난다. 사실 유령처럼 되돌아오는 사자들이야 말로 합당한 경의를 받지 못한 채 너무 빨리, 너무 깊이 매장된 자들이 아닐까? 그리고 후회란 기억의 과잉을 드러낸다기 보다는 기억 내용의 철저한 되새김에 대한 무능력이나 실패를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p.51-54
따라서 반복은 어떤 차이로서 나타나지만, 이 차이는 절대적으로 개념 없이 성립하는 치이며, 이런 의미에서 그것은 무차별한 차이다. '실재적으로', '엄격하게', '절대적으로'라는 말들은 자연적 봉쇄의 현상을 배후로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어떤 일반성만을 규정하는 논리적 봉쇄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시도 전체는 어떤 심각한 곤란에 직면하여 위태로워진다. 어떤 구별되는 대상들에 대해 개념의 절대적 동일성을 내세우는 한, 우리는 단지 부정적인 설명과 결핍에 의존하는 설명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 결핍이 개념이나 재현 자체의 본성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라 해도 사정은 여전히 마찬가지다. 첫 번째 경우 반복이 성립하는 것은 명목적 개념이 본성상 유한한 내표를 지니기 때문이다. 두 번째 경우 반복이 성립하는 것은 자연의 개념이 본성상 기억을 결여하고 소외되어 있으며 자신의 바깥에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경우는 자유의 개념이 무의식 상태에 놓여 있고 기억 내용과 표상이 억압되어 있기 대문에 반복이 성립한다. 이 모든 경우들에서 반복하는 것은 오로지 '포괄'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덕분에 반복한다. 회상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므로 반복을 행하는 것이다. 어디에서건 반복을 정당화해준다고 간주되는 것은 개념의 불충분성이자 그 개념의 표상에 동반하는 것들(기억과 자기의식, 재기억과 재인)의 불충분성이다. 따라서 개념 안의 동일성 형식에 기초한 모든 논변의 결함은 바로 여기에 있다. 즉 이 논변들은 반복을 단지 명목적으로 정의하고 부정적으로 설명하는 데 그칠 뿐이다. p.55-56
죽음은 물질적 모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반면 죽음본능을 가면이나 가장복들에 대한 정신적 관계 안에서 이해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반복이란 것은 그야말로 자신을 구성해 가는 가운데 스스로 위장하는 것, 스스로 위장함으로써만 자신을 구성하는 어떤 것이다. 반복은 가면들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변에서 저 가면으로 옮겨 가면서 자신을 형성한다. 마치 하나의 특이점에서 다른 특이점으로, 하나의 특권적 순간에서 다른 특권적 순간으로 이행하듯 자리를 옮겨 가면서, 변이형들과 더불어 그리고 변이형들 안에서 자신을 형성한다. 가면들이 가리키는 것은 다른 가면들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반복되어야 할 최초의 항이란 것은 없다. 또한 우리가 어린 시절 어머니에 대해 품는 사랑조차 다른 여성들에 대한 어른들의 또 다른 사랑들을 반복한다. 이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주인공이 어머니와 더불어 오데트에 대한 스완의 열정을 재연하는 것과 다소 비슷하다. 그러므로 반복된느 것은 반복 안에서 형성되며 또한 은폐된다. 그런 한에서 그것은 결코 반복으로부터 고립되거나 추상될 수 없다. 위장의 작업 자체로부터 추상되거나 추론될 수 있는 헐벗은 반복은 있을 수 없다. 위장하는 것과 위장되는 것은 같은 사태이다. p.58-59
가면이야말로 반복의 참된 주체이다. 반복은 본성상 재현이나 표상과 다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반복되는 것은 표상될 수 없다. 다만 자신을 지시하는 것을 통해 지시되긴 하나 이내 다시 가려질 뿐이다. 가면을 쓰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반복되는 것 그 자체도 역시 자신을 기리키는 것에 가면을 씌우기는 마찬가지다. p.60
에로스와 타나토스는 어떻게 구별되는 것일까? 에로스는 반복되어야 하고 오로지 반복 안에서만 체험될 수 있다. 하지만 (초월론적 원리인) 타나토스는 에로스에 반복을 가져다주는 것, 에로스를 반복에 종속시키는 것에 해당한다. 바로 이런 관점에 설 때만 우리는 억압과 관련된 애매한 문제들, 가령 억압의 기원, 본성, 원인들 그리고 억압이 관계하는 정확한 항들에 대한 문제들에서 어떤 진척을 이루어낼 수 있다. p.61
반복이 우리를 속박하고 파괴한다면, 우리를 해방하는 것 역시 반복이다. 반복은 이 두 경우 모두 자신의 '악마적인' 역량을 증언한다. 모든 치료는 반복의 밑바닥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여행이다. 확실히 전이에는 과학적 실험과 유비적인 어떤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환자는 분석가의 인격을 '대상'인 것처럼 취급하면서 자신의 장애 전체를 특권화된 어떤 인위적 조건들 안에서 반복한다고 가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이에서 반복이 떠맡는 기능은 동일성을 딘 어떤 사건, 인물, 정념들을 확인하는 데 있지 않다. 그것은 역할들을 인증하고 가면들을 선별하는 데 있다. 전이는 겨우 하나의 경험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분석적 경험 전체에 근거를 마련해주는 어떤 원리이다. 역할들 자체는 본성상 에로스의 성격을 띠지만, 그 역할들을 인증하는 시험은 죽음본능이라는 보다 높은 원리, 보다 심층적인 재판관에 호소한다. 사실 전이에 대한 성찰은 {쾌락원칙을 넘어서는} '저편'을 발견하도록 유도한 결정적인 동기였다. 이런 의미에서 반복은 스스로 우리의 병과 건강, 우리의 타락과 구원을 선별하는 유희로 자신을 구성해간다. 어떻게 이 유희를 죽음본능에 관계시킬 수 있는 것일까? 확실히 그것은 랭보에 대한 멋진 책에서 밀러가 말하고 있는 것과 가까운 의미에서 예감되어야 한다. 즉 "나는 내가 자유로웠다는 것을, 내가 경험했던 죽음이 나를 자유롭게 해주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죽음본능이라는 관념은 세가지 상보적이고 역설적인 요구들에 입각해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곧 반복에 실증성을 띤 어떤 원천적 원리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 하지만 반복에 어떤 자율적 위장의 역량을 부여하는 것, 끝으로 반복에 어떤 내재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 내재적 의미 안에서 공포는 선별이나 자유의 운동과 긴밀하게 뒤섞여 서로 구별되지 않는다. p.62-63
우리의 문제는 반복의 본질에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반복은 개념이나 재현 안의 동일성 형식에 의해서는 설명될 수 없는지, 어떤 의미에서 반복은 우월하고 월등한 어떤 '실증적' 원리를 요구하는지 등을 아는 것이다. 이런 탐색은 자연의 개념과 자유의 개념 전체에 대한 고찰을 필요로 한다. 일단 이 경우의 경계에 있는 장식의 모티프로부터 반복을 생각해보자. 여기서는 하나의 도형이 절대적으로 동일한 어떤 개념 아래에서 재생산된다..... 그러나 실제로 예술가는 그런 식으로 작업하지 않는다. 그는 한 도형의 표본들을 병치하지 않는다. 그는 매 순간 한 표본의 한 요소를, 뒤따르는 표본의 또 다른 요소와 결합한다. 그는 역동적인 구성의 과정 속에 어떤 불균형, 불안정, 비대칭, 일종의 입 벌림 현상 등을 끌어들이며, 이런 요소들은 오로지 총체적 결과 안에서만 사라지게 된다. 이런 경우에 대해 논평하면서 레비스트로스는 다음과 같이 쓴다. "이 요소들은 기왓장들처럼 서로 엇물리며 도형은 오직 마지막에 가서야 안정성을 띤다. 도형을 낳는 동역학적 과정 전체는 이 안정성을 통해 확증되는 동시에 부인된다." 이는 인과성의 개념 일반에 대해 유효한 말이다. 왜냐하면 예술적 인과성이나 자연적 인과성에서 중요한 것은 눈앞에 드러난 대칭적 요소들이 아니라 원인 안에 결여된 요소들, 원인 안에 있지 않은 요소들이기 때문이다 -원인이 결과보다 대칭을 더 적게 가질 가능성이 중요하다. 게다가 만일 이런 가능성이 어떤 특정한 순간에 실제적으로 실현되지 않는다면, 그 인과관계는 영원히 가설적인 것으로, 단순한 논리적 범주로 남겨질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인과성의 논리적 관계는 신호화라는 물리적 과정과 분리될 수 없다. 이 과정이 없다면 그 논리적 관계는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비대칭적 요소들을 갖추고 불균등한 크기의 질서들을 거느리고 있는 하나의 체계를 '신호'라 부른다. 그리고 그런 체계 안에서 발생하는 것, 간격 안에서 섬광처럼 번득이는 것, 불균등한 것들 사이에서 성립하는 어떤 소통 같은 것을 '기호'라 부른다. 기호는 분명 어떤 효과이지만, 그 효과는 두 가지 측면을 지니고 있다. 한 측면에서 기호는 그야말로 본연의 기호로서 어떤 생산적인 비대칭을 표현한다. 다른 한 측면에서 기호는 그 비대칭을 소멸시키는 경향이 있다. 기호는 결코 상징의 질서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기호는 어떤 내적인 {이념 안의} 차이를 함축하면서 (그러나 여전히 그 질서의 재생산 조건들을 외부에 남겨두면서) 상징의 질서를 예비한다. 우리는 '대칭의 결여'라는 부정적 표현 때문에 속아서는 안 된다. 이 표현은 인과 과정의 기원과 실증성을 가리킨다. 이 표현이 표현하는 것은 실증성 자체인 것이다. 장식의 모티프의 예를 통해 암시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본질적인 것은 인과성을 분해해서 두 가지 유형의 반복을 구별하는 데 있다. 하나는 오직 추상적인 총체적 결과에만 관련되며, 다른 하나는 작용 중의 원인에만 관련된다. 하나는 정태적인 반복이고 다른 하나는 동태적인 반복이다. 하나는 작업의 결과이지만, 다른 하나는 몸짓의 '진화'와 같은 것이다. 하나는 한 도형의 평범한 표본들 사이에 어떤 외부적 차이만을 존속케 하는 하나의 똑같은 개념에서 시작되지만, 다른 하나는 {개념 밖에 있지만 이념 안에 있는} 어떤 내적 차이의 반복이다. 이 반복은 각각의 계기들 안에 내적 차이를 포함하며, 그 차이를 한 특이점에서 또다른 특이점으로 운반한다. p.64-66
박자는 단지 리듬을 감싸는 봉투, 리듬들 간의 관계를 담고 있는 외피일 뿐이다. 동등하지 않은 점들, 굴절하는 점들, 율동적인 사건들의 되풀이가 등질적이고 평범한 요소들의 재생보다 훨씬 근본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도처에서 박자-반복과 리듬-반복을 구별해야 한다. 전자는 단지 후자의 겉모습이거나 추상적 효과에 불과하다. 물질적이고 헐벗은 반복이 나타난다면, 이는 항상 또 다른 반복이 그 안에서 자신을 위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안에서 또 다른 반복이 자신을 위장하면서 그 헐벗은 반복을 구성하는 동시에 자기 자신을 구성하는 것이다. p.67-68
기호는 적어도 세 가지 관점에서 다질성을 포함한다. 먼저 기호를 담지하거나 발산하는 대상 안에서. 이 대상은 불균등한 두 질서 - 기호는 크기나 실재성의 불균등한 질서들 사이에서 섬광처럼 번득인다 - 처럼, 필연적으로 어떤 수준의 차이를 드러낸다. p.70
아무개가 어떻게 배우는가를 말한다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즉 거기에는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어떤 친밀성, 기호들에 대한 친밀성이 존재한다. 이 친밀성을 통해 모든 교육은 애정의 성격을 띤 어떤 것이 되지만 또한 동시에 치명적인 어떤 것이 된다. 우리는 "나처럼 해봐."라고 말하는 사람 곁에서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 오로지 "나와 함께 해보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만이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있다. 이들은 따라해야 할 몸동작들을 보여주는 대신 다질적인 것 안에서 개봉해야 할 기호들을 발신하는 방법을 안다. 달리 말해서 관념적 운동성이란 것은 없다. 오로지 감각적 운동성만이 있는 것이다. 신체는 자신의 특이점들을 물결의 특이점들과 조합할 때 어떤 반복의 원리와 관계를 맺는다. 이 반복은 더 이상 같음의 반복이 아니다. 그것은 다름을 포괄하는 반복이고, 하나의 물결과 몸짓에서 또 다른 물결과 몸짓으로 이어지는 차이를 포괄하는 반복, 이 차이를 그렇게 구송된 반복의 공간으로 운반하는 반복이다. 배운다는 것, 그것은 분명 어떤 기호들과 부딪히는 마주침의 공간을 만들어간다는 것이다. 이 공간 안에서 특이점들은 서로의 안에서 다시 취합된다. 여기서 반복은 자신을 위장하는 동시에 형성한다. 그리고 배움의 과정에는 언제나 어떤 죽음의 이미지들이 내포되어 있다. 이 이미지들은 배움이 개봉해가는 다질성에 의해 조장되고 있으며, 배움이 창조하는 공간의 경계의 머문다. p.71-72
동일성을 띤 요소들이 겉으로 드러내는 반복이 어떻게 필연적으로 어떤 잠복해 있는 주체에 의존하는지, 그리고 이 주체는 어떻게 그 요소들을 통해 스스로 자신을 반복하는 가운데 첫 번째 반복의 심장부에서 '또 다른' 반복을 형성하는지를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또 다른 반복이 조금도 근사적이거나 은유적이지 않다고 말할 것이다. 오히려 거꾸로 이 반복은 모든 반복의 정신이다. 이 반복은 모든 반복의 문자 그 자체로서, 투명무늬나 구성적 암호의 상태에 있다. 바로 이 새로운 반복이 개념 없는 차이의 본질을 형성하고 매개되지 않은 차이의 본질을 형성하는 것이며, 모든 반복은 여기서 나온다. 바로 그것이 문자 그대로의 반복이며 정신적인 반복으로서, 반복의 첫 번째 의미를 담고 있다. 물질적 의미는 이 첫 번째 의미로부터 따라 나오는 결과이며, 그로부터 마치 어떤 조개껍질처럼 분비된 것이다. p.75
일반적인 것의 질서를 열어놓는 것은 바로 차이와 반복의 불일치이다. 이런 의미에서 가브리엘 타르드는 유사성 자체가 하나의 어긋나 있는 반복일 뿐임을 지적했다. 즉 참된 반복이란 자신과 같은 등급의 차이에 직접적으로 상응하는 반복이라는 것이다. 그는 자연과 정신 안에서 차이와 반복 사이에 점점 더 완벽한 일치 관계를 열어놓기 위한 비밀스러운 노력을 발견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새로운 변증법에 도달하는 데 성공한 사람은 오로지 타르드밖에 없다. *주 49 - Lois de l'imitaion에서 가브리에 타르드는 어떻게 유사성 -예를 들면 서로 다른 유형의 종들 사이에서 볼 수 있는 유사성- 이 물리적 환경의 동일성으로 귀착되는지, 다시 말해서 문제의 형태들보다 하위의 요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떤 반복적 과정으로 귀착되는지를 보여준다. 타르드의 철학 전체는 -우리는 나중에 이 점을 더 정확히 알게 될 것이다- 차이와 반복이라는 두 범주 위에 기초하고 있다. 즉 차이는 반복의 기원인 동시에 목적지로서, "점점 더 높은 등급의 자유"를 취하고 그에 따라 점점 더 "강력해지고 정교해지는" 어떤 운동 속에 놓여 있다. 타르드는 모든 영역에서 변별적 차이의 관계를 낳고 분화해가는 이 반복으로 대립을 대체하자고 주장한다. 루셀과 페기는 타르드의 공식을 자신들의 것으로 요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즉 "반복은 확실히 반-정립 명제보다 보기 들물게 힘에 넘치고 피로를 덜 주며, 주체를 갱신하는 데 아주 적절한 문체의 기법이다" 타르드는 반복에서 지극히 프랑스적인 이념을 보았다. 사실 키에르케고르는 반복에서 지극히 덴마크적인 개념을 보았다. 이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반복이 헤겔의 변증법과는 전혀 다른 변증법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다. p.77
도식이 증언하는 것처럼 외생적 차이들의 공간적 질서와 내생적 차이들의 개념적 질서가 궁극적으로 조화를 이룬다면, 이것의 보다 심층적인 원천은 이런 미분적이고 강도적인 요소에, 순간에 이루어지는 연속체의 종합에 있다. 이 종합은 어떤 연속적 반복의 형식 아래 우선 내면적으로 이념들에 부합하여 공간을 낳는다. 그런데 라이프니츠에게서 외생적 차이들과 내생적이고 개념적인 차이들 간의 친화성은 이미 어떤 연속적 반복의 내적 과정에 호소하고 있다. 이 과정은 어떤 미분적이고 강도적인 요소 위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 요소는 점 안에서 연속체의 종합을 실행하여 그 안쪽의 공간을 분만한다. *주 54 - (옮긴이 주) 칸트와 라이프니츠를 배경으로 (이념적 차운의) '연속체의 종합'에 대해 말할 가능성을 언급하는 이 대목은 근거 문헌이 명시되지 않아 무척 애매하지만, 이 책 4장 전반부에서 상세히 펼쳐질 '점진적 규정'(규정 가능성, 상호적 규정, 완결된 규정)에 대한 논의의 사전 포석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아마 라이프니츠의 경우에는 그가 스피노자를 논박하면서 남긴 다음과 같은 문장을 인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연장은] 사물들이 서로 유사하거나 식별 불가능한 한에서 감당하는 어떤 무한정한 반복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p.79-80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 물음과 마주하게 된다. 먼저 차이의 개념은 무엇인가? 단순한 개념적 차이로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유한 이념을 요구하는 차이, 이념 안의 어떤 독특성을 요구하는 그런 차이의 개념은 무엇인가? 다른 한편 반복의 본질은 무엇인가? 개념없는 차이로 환원되지 않고 어떤 똑같은 개념 아래 재현된 대상들의 외양적 성격과 혼동되지 않는 반복, 다만 그 역시 이념의 역량에 해당하는 독특성을 증언하는 반복의 본질은 무엇인가? 차잉와 반복이라는 두 기초개념의 마주침은 결코 처음부터 설정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두 노선, 곧 반복의 본질로 이어지는 노선과 차이의 이념으로 이어지는 노선이 교차하고 간섭하는 모습들을 들여다 볼 때에나 비로소 나타나는 마주침일 것이다. p.81
차이는 이제 개념의 내포 안에 있는 하나의 술어에 지나지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끊임없이 종차의 이런 술어적 성격을 환기시킨다. 하지만 그는 종차의 술어적 성격이 지닌 어떤 이상한 능력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가령 술어로서 귀속되는 것 못지않게 귀속시키는 능력, 유의 질을 양태적으로 변화시키는 만큼 유 자체를 달라지게 만드는 능력 등이 그것이다. 그래서 종차가 고유한 개념의 요구들을 충족시키는 듯한 모든 절차들은 근본적인 혼동에서 출발하고, 따라서 착오에, 심지어 모순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다. p.92-93
따라서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나마 어떤 동일한 개념 혹은 공통의 개념이 여전히 존속한다. 그것은 존재의 개념이다. 이 존재라는 개념은 하나의 유가 자신의 종들에 대해 그런 것처럼 집합적이지 않다. 그것은 다만 분배적이고 위계 설정적일 분이다. 즉 존재라는 개념은 그 자체 안에 내용을 갖지 않는다. 단지 형상적으로 구별되는 항들 -존재의 개념이 술어가 되는 항들- 에 비례하는 내용만을 가질 뿐이다. 이 항들이 존재에 대해 서로 동등한 관계를 가질 필요는 없다. 각각의 항이 존재와 맺는 관계가 그 항에 내면적이면 족한 것이다. 존재의 개념이 지닌 두 가지 특징 -오로지 분배적으로만 공통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과 위계적 순서에서만 일차적 의미를 갖는다는 것- 을 생각하면, 그것의 역할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해진다. 존재가 범주들에 대해 갖는 역할은 유가 일의적 의미를 띤 종들에 대해 갖는 역할과 다르다. 하지만 존재의 개념이 지닌 이런 두 특징에 비추어 볼 때, 존재의 다의성이란 것이 매우 각별한 것임을 또한 알 수 있다. 즉 여기서 문제는 유비에 있다. *주 12 - 이미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아리스토텔레스 자신은 존재에 대해 유비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그는 범주들을 '하나에 대한 것들'로, 그리고 확실치는 않지만 '일련의 것들'로 규정한다.(순수한 다의성을 제외한다면, 이는 공통의 유 없이 '차이'가 존재하는 두 가지 경우이다.) '하나에 대한 것들'은 어떤 단일한 항을 염두에 두고 언명된다. 이것은 공통의 의미와 같다. 그러나 이 공통의 의미는 어떤 유가 아니다. 왜냐하면 명시적이고 구별되는 집합적 통일성을 형성하는 유와는 달리, 공통의 의미는 (함축적이고 혼잡한) 분배적 통일성만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스콜라 학파가 '하나에 대한 것들'을 '비례의 유비'로 번역한 것은 옳은 일이다. 사실 이 유비는 엄밀한 수학적 의미에서 파악될 필요가 없으며, 동등한 관계를 가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유비는 어떤 내면적 관계에 의해 정의되며, 이는 앞의 것과 전적으로 다른 것이다. 즉 범주들이 존재와 맺는 관계는 각 범주에 내면적이다. 범주들 각각은 자신의 고유한 본성에 힘입어 그 나름의 통일성과 존재를 지닌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범주들을 나눔과 같은 것으로 보면서 이 분배적 특징에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의 특정한 해석들에소 불구하고 존재가 '존재자들'에게 분배되는 방식에 상응하는 존재의 배당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에 대한 것들'에서 단일한 항은 단순히 공통의 의미에 해당하는 존재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일차적 의미라는 뜻의 실체이다. 이로부터 위계를 함축하는 '일련의 것들'의 관념으로 이행할 수 있다. 스콜라 학파는 여기서 '비율의 유비'에 대해 말한다. 즉 이제 서로 다른 항들에 형상적으로 관계하는 어떤 분배적 개념 대신 주요 항에는 형상적이고 월등하게, 다른 항들에는 그보다 덜한 정도로 관계하는 어떤 계열적 개념이 있다. 존재는 현실성을 띠고 있으며, 그래서 무엇보다 비례의 유비다. 그러나 존재는 '잠재적으로는' 또한 비율의 유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p.94-95
즉 유비적 판단에 대해 체계적 분배가 필수 불가결한 것처럼, 유사성의 지각에 대해서는 방법적인 연속성이 그에 못지않게 필수 불가결하다. 그러나 둘 중 어느 관점에 서든, 본래적 차이는 오로지 반성적 개념으로만 드러날 뿐이다. 사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접해 있는 유사한 종들로부터 그 종들을 포섭하는 어떤 유적 동일성으로 이행할 수 있고, 따라서 감각 가능한 하나의 연속적 계열의 흐름 속에서 유적 동일성들을 선취하거나 절단해낼 수 있다. 다른 층위에서 보자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각기 동일성을 띤 유들로부터 그 유들이 이지적인 것 안에서 서로 유지하는 유비적 관계들로 이행할 수 있다. 이런 반성적 개념으로 머물러 있는 한에서 차이는 자신이 재현의 모든 요구들에 전적으로 순응하고 있음을 증언하고 있다. 재현은 바로 그런 차이를 통해 유기적 재현이 되는 것이다. 사실 반성적 개념 안에서 매개하고 매개되는 차이는 지극히 당연하게 개념의 동일성, 술어들의 대립, 판단의 유비, 지각의 유사성에 복종한다. 여기서 재현이 필연적으로 지니게 되는 4중의 특성을 재발견 할 수 있다. 문제는 이 모든 반성적 측면들 아래 차이가 자신의 고유한 개념과 자신의 고유한 실재성을 한꺼번에 상실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데 있다. 만일 차이가 반성적 개념이기를 그치고 정녕 참다운 개념을 되찾을 수 있다면, 이는 사실 차이가 곧바로 어떤 파국을 지시할 때만 가능한 일이다. 그 파국은 유사성들의 계열에서는 연속성의 파열로 나타날 수도 있고, 유비적인 구조들 사이에서는 건널 수 없는 단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차이는 파국적 성격을 띠는 한에서만 반성적이기를 그칠 수 있다. 물론 차이가 파국성을 띤다는 것과 반성적 성격을 띤다는 것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사태일 것이다. 그러나 파국으로서의 차이, 바로 그것이야말로 환원 불가능하고 반항적인 어떤 바탕을, 유기적 재현의 표면적인 균형 아래 계속 움직이고 있는 바탕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p.98-99
나는 영국에 다녀왔고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든다. 지금은 고프로 영상을 옮기는 중이다. 2시간 후부터는 나갈 준비를 하고 일을 가야한다. 다녀 온 것을 어떻게 기록을 남길까. 혹은 굳이 남기지 말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든다. 다만 이제 점점 한국이 다시 한국처럼 되어간다는 인상이다. 내 집도 단순히 하루만에 나의 생활 공간이 되어버렸고 말이다. 우선 할 일들, 당장 전시 준비를 해야한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떨어진건가? 사실 영국에 가지말고 했었어야 하는데 이제 준비를 빡세게 해야되기는 한다. 명민이는
여기 문제는 역량 -절대적으로 고려된 역량- 의 정도들에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한 존재자가 궁극적으로 '도약'하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그 정도가 어떠하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의 끝에까지 이르고 이로써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끝에까지'라는 말은 여전히 어떤 한계를 정의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여기서 한계, 경계가 가리키는 것은 사물을 하나의 법칙 아래 묶어두는 어떤 것도, 사물을 끝마치거나 분리하는 어떤 것도 아니다. 거꾸로 그것은 사물이 자신을 펼치고 자신의 모든 역량을 펼쳐가기 시작하는 출발점이다. 휘브리스는 이제 단순한 비난의 표적이 아니다. 가장 작은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더불어 생각되는 즉시 가장 큰 것과 동등해진다. 이 봉인하는 척도는 모든 사물들에 대해 같은 것이며, 실체, 질, 양 등에 대해서도 같다. 왜냐하면 이 척도는 유일한 최대치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모든 등급들에 걸쳐 개봉된 상이성이 자신을 봉인하는 동등성에 이르게 되는 곳, 그곳에서 이 척도는 유일한 최대치다. 이 존재론적 척도는 앞에서 말한 첫 번째 척도보다는 오히려 사물들의 과도에 더 가깝다. 이 존재론적 위계는 앞에서 말한 첫 번째 위계보다는 존재자들의 휘브리스나 무정부 상태에 더 가깝다. 그것은 모든 악마들이 결합된 괴물이다. "모든 것은 동등하다."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동등하고 일의적인 존재 안ㅇ서 언명되고 동등하지 않은 것을 통해 언명된다는 조건에서 이 말은 유쾌한 울림을 지닐 수 있다. 동등한 존재는 중개나 매개 없이 모든 사물들에 직접적으로 현전한다. 비록 사물들이 이 동등한 존재 안에서 동등하지 않은 채로 자리한다고 해도, 그 존재 자체는 직접 현전한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어떤 절대적인 가까움 속에 있다면, 이는 그것들이 휘브리스의 성격을 띨 때 그런 것이다. 또 그때는 크든 작든, 열등하든 우월하든 그 어떤 것도 존재에 더나 덜 참여하는 것이 아니며, 존재를 유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존재의 일의성은 또한 존재의 동등성을, 평등을 의미한다. 일의적 존재는 유목적 분배이자 왕관을 쓴 무정부 상태이다. p.103-104
무엇보다 먼저 보여주어야 하는 것은 개체화의 선행성이다. 어떻게 개체화가 형상과 질료에 종과 부분들에, 그리고 구성된 개체의 다른 모든 요소들에 권리상 선행하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직접적으로 차이에 관계하는 한에서 존재의 일의성은 어떤 증명을 요구한다. 이 증명을 통해 어떻게 개체화하는 차이가 존재 안에서 유적 차이들에, 종적 차이들에, 그리고 심지어는 개체적 차이들에도 선행하는지 -어떻게 존재 안에서 먼저 성립하는 개체화의 장이 형상들의 종별화를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부분들의 규정과 개체적 변이들을 조건짓는지- 를 밝혀야 한다. 개체화는 형상에 의해서도 질료에 의해서도 발생하지 않는다. 질을 통해서도 연장을 통해서도 성립하지 안흔다. 왜 그런가? 이는 개체화가 이미 형상, 질료, 연장성을 띤 부분들에 의해 가정되어 있기 때문이다.(개체화가 단지 이들과 본성상 다르기 때문만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두 가지 방식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먼저 존재의 유비 안에서 유적 차이와 종적 차이들이 개체적 차이들에 매개되는 방식 일반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일의성 안에서 일의적 존재가 개체화하는 차이들을 통해 직접적으로 언명되는 방식, 혹은 보편적인 것이 모든 매개로부터 독립하여 지극히 독특한 것을 통해 언명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 유비는 존재가 어떤 공통의 유라는 점을 부정하며, 이는 차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일의적 존재는 거꾸로 확실히 공통적이다. (개체화하는) 차이들은 '존재하지 않고' 존재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앞으로 아주 각별한 의미에서 이 차이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즉 차이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는 일의적 존재 안에서 그것들이 어떤 부정 없는 비-존재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먼저 이미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점에 주목하자. 그것은 일의성 안에서 존재하거나 존재해야만 하는 것은 개체화하는 차이들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존재하거나 존재해야만 하는 것은, 존재, 본연의 차이인 존재이다. 존재는 차이를 통해 언명된다는 의미에서 차이 자체이다. 그리고 존재는 일의적이지 않은데 그 안에서 우리가 일의적인 것은 결코 아니다. 존재는 일의적이다. 그런 존재 안에서,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개체성이 다의적인 것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다.p.106-107
따라서 회귀는 유일한 동일성이다. 하지만 이것은 이차적인 역량에 해당하는 동일성, 차이의 동일성일 뿐이다. 그것은 차이나는 것을 통해 언ㄴ명되고 차이나는 것의 둘레를 도는 동일자이다. 차이에 의해 산출되는 이런 동일성은 '반복'으로 규정된다. 그래서 영원회귀의 반복은 또한 차이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같음을 사유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이런 사유는 결코 더 이상 어떤 이론적 재현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차이들을 산출 능력에 따라 실천적으로 선별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회귀하는 능력이나 영원회귀의 시험을 견뎌내는 능력에 따라 선별하는 것이다. 영원회귀의 선별적 성격은 니체의 이념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 이념에 따르면 회귀하는 것은 전체도, 항상 같은 것도 아니다. 혹은 선행의 동일성 일반도 아니다. 게다가 그것은 전체의 부분들에 해당하는 큰 것과 작은 것도 아니고 같은 것의 요소들인 작거나 큰 것도 아니다. 되돌아오는 것은 오로지 극단적 형상들 뿐이다. 크건 작건 상관없이 자신의 한계 안에서 자신을 펼쳐가는 형상, 자신의 역량의 끝까지 나아가는 가운데 자신을 스스로 변형하고 서로의 안으로 이행하는 극단적 형상들만이 되돌아온다. 되돌아 오는 것은 오로지 극단적이고 과잉성을 띤 것, 다른 것으로 이행하면서 동일한 것으로 생성하는 것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회귀는 힘의 의지의 변신과 가면들로 연출되는 연극적 세계를 통해 언명된다. 영원회귀가 언명되는 무대는 이 의지의 순수한 강도들이 드러나는 연극적 세계이다. 이 강도들은 변동하는 개체화 요인들로서, 더 이상 이러저러한 개체나 이러저러한 자아의 인위적 한계들 안에 붙들려 있지 않다. 영원회귀, 되돌아오기는 모든 변신들에 대해 공통의 존재를 표현한다. 그것이 표현하는 것은 모든 극단적인 것, 역량의 모든 실현 등급들에 공통되는 척도와 존재이다. 그것은 동등하지 않은 모든 것의 동등-함, 자신의 비동등성을 충만하게 실현할 줄 알았던 모든 것의 동등-함이다. 같은 것으로 생성하는 가운데 극단적인 모든 것은 동등하고 공통적인 존재 안에서 서로 소통한다. 회귀를 규정하는 것은 그런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초인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우월하고 월등한 형식에 의해 정의된다. 여기서 니체가 고귀하다고 부르는 것을 간파할 줄 알아야 한다. 그는 에너지 물리학자의 언어를 빌려, 자신을 스스로 변형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고귀하다고 부르고 있다. 니체는 휘브리스가 모든 헤라클레이토스주의자들의 진정한 문제라고 말하고, 혹은 위계는 자유로운 정신들의 문제라고 말한다. 이때 그는 언제나 똑같은 사태를 가리키고 있다. 즉 존재하는 모든 것은 휘브리스 안에서 자신을 되돌아오게 만드는 존재를 발견한다. 니체는 왕관을 쓴 무정부 상태, 전도된 위계를 가리키고 있다. 이 위계는 동일자를 차이나는 것에 종속시키면서 처음 시작되고, 이로써 차이의 확실한 선별을 보장한다. 이런 모든 측면에서 볼 때, 영원회귀는 존재의 일의성이며 그런 일의성의 실제적 실현이다. 영원회귀 안에서 일의적 존재는 단지 사유되고 긍정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현된다. 존재는 단 하나의 같은 의미에서 언명된다. 하지만 이 의미는 영원회귀의 의미이다. 그것은 존재를 언명하고 있는 것의 회귀나 반복에 해당하는 영원회귀의 의미이다. 영원회귀의 바퀴는 차이에서 출발하여 반복을 산출하는 동시에 반복에서 출발하여 차이를 선별한다. p.111-113
현대 생리학이 드러내듯, 더 이상 감각 장치는 고전 과학이 담당하게 했던 전달자의 역할에 고유한 것이 아니다. 촉각장치의 비피질 장애는 틀림없이 더위, 추위, 억압의 감각점을 무디게 하고 보존점의 감도를 떨어뜨린다. 그러나 사람들이 손상당한 장치에다 충분하게 퍼진 흥분을 가하게 되면 특별한 감각들이 다시 나타난다. 역치의 상승은 손의 보다 왕성한 운동에 의해서 보상된다. 사람들은 감성의 초보 단계에서, 부분적 자극들의 상호 협조 그리고 감각 체계와 운동 체계의 협조를 예상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협조들은 변화하는 생리학적 좌표 내에서는 감각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며, 따라서 신경 과정을 주어진 전언의 단순한 변환으로 규정하지 못하게 한다. 시각적 기능의 파괴는 장애의 소재가 어디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법칙을 따른다. 즉 우선 모든 색깔은 영향을 받고 그 자신의 포화도를 상실한다. 그 다음에 스펙트럼은 단순화되고 4색 스펙트럼이 되었다가 2색 스펙트럼으로 된다. 결국 우리는 단색의 회색에 이르게 되고, 게다가 병리적 색깔은 평범한 정상적 색깔과 동일시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말초 장애처럼 중추 장애에서도 "신경 실체의 손실은 몇 가지 성질들의 결여를 낳는 것만이 아니라 덜 분화되고 더 본원적인 구조에로의 이행을 낳는다." 역으로, 정상적 기능은 외부 세계의 원문이 재생되지 않고 구성되는 통합 과정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감각'을 파악하려고 노력하되 감각을 준비하는 신체적 현상의 조망에서 파악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심리적 개체, 즉 어떤 알려진 변수들의 기능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총체와 결합되고 이미 하나의 의미를 부여받은 형성, 즉 더 복잡한 지각과는 정도에서만 구별될 뿐이어서 순수 감각 가능한 것을 한정지을 우리의 시도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형성을 발견한다. 감각의 생리학적 규정은 없으며, 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심리생리학의 자율성은 없다. 왜냐하면 생리학적 사건 그 자체는 생물학적 법칙과 심리학적 법칙에 복종하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요소적인' 심적 기능의 위치를 알아내고 이 기능을 신체적 하부 구조와 덜 엄밀하게 결합되어 있는 '상위적' 기능과 구별짓는 확실한 방법을 말초적 조건에서 얻는다고 믿었다. 보다 정확하게 분석함으로써 이 두 가지 종류의 기능이 서로 교차한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요소적인 것은 더 이상 첨가되어 전체를 구성하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전체가 자기를 구성하기 위한 단순한 기회도 아니다. 요소적 사건은 이미 의미를 띠고 있고, 상위적 기능은 하위 작용을 이용하고 승화시키면서 보다 통합된 존재 방식 또는 보다 가치 있는 적응을 실현할 뿐이다. 이와 더불어, "감각적 경험은 출산, 호흡, 성장처럼 생명적 과정이다." 심리학과 생리학은 더 이상 평행선을 긋는 두 개의 과학이 아니라 행동에 대한 두 개의 규정인즉, 전자는 구체적 규정이고 후자는 추상적 규정이다. 심리학자가 생리학자에게 '인과적' 감각 규정을 요구할 때, 우리는 그가 그런 기초에서 자기 특유의 난점에 재차 부딪힌다고 말한 바 있고, 이제 우리는 그 이유를 안다. 생리학자는 모든 과학이 상식에서 차용하는 그리고 과학의 발전을 저해하는 실재론적 편견으로부터 스스로를 위해 벗어나야 한다. 현대 생리학에서 '요소적'과 '상위적'이라는 용어의 의미 변화는 철학의 변화를 알려준다. 과학자들 역시 외부 세계 그 자체의 관념에 대한 비판을 배워야 한다. 왜냐하면 사실들 그 자체는 과학자에게 신체를 전언의 전달자로서 보는 관념을 버리라고 제안하기 때문이다. 감각적인 것은 우리가 감각으로써 파악하는 것이기는 하나, 우리는 곧장 그 '으로써'가 단순한 도구가 아님을, 감각장치가 전도체가 아님을, 생리학적 인상이 그 말단에서조차도 한때 중추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던 관계들에 개입되어 있음을 안다.
-모리스 메를로-퐁티, 지각의 현상학, p.45-47
무한소의 분석[미적분학]은 본질들의 언어인가, 아니면 편의를 위한 허구인가? 이런 양자택일적 물음은 잘못된 물음이다. 왜냐하면 '경우'에 의한 포섭이나 부수적 속성들의 언어는 자신만의 고유한 독창성을 갖기 때문이다. 본질들의 구별을 유지하는(하나가 다른 하나에 대해 비본질적인 것의 역할을 맡고 있는 한에서 그 구별을 유지하는) 이런 무한소의 절차는 모순과는 완전히 다르다. 또한 그것은 "부차모순"이라는 특수한 이름으로 불러야 마땅하다. 무한하게 큰 것 안에서는 동등한 것은 동등하지 않은 것과 모순을 이루지만, 동등하지 않은 것을 본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또 동등한 것은 자기 자신과 모순을 이루지만 동등하지 않은 것을 부정하면서 자기 자신을 부정한다. 그러나 무한하게 작은 것 안에서는 동등하지 않은 것은 동등한 것과 부차모순을 이루고 자기 자신과 부차모순을 이룬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을 본질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자신의 경우 안에 포함한다. 본질적인 것은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 안에 담고 있는 반면, 비본질적인 것은 본질적인 것을 자신의 경우 안에 포괄하고 있다.
라이프니츠에 따른 차이의 논리학과 존재론: 부차모순(연속성과 식별 불가능자들)
부차모순은 오로지 부수적 속성들에만 관계한다. 이런 이유에서 부차모순은 모순보다 멀리 나아가지 못한다고 해야 하는가? 사실 '무한히 작은 치아'라는 표현은 직관에 대해 차이가 소멸해버린다는 점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차이는 자신의 개념을 발견한다. 게다가 그 자체로 소멸하는 것은 오히려 직관이다. 직관은 미분적 관계, 곧 미분비 앞에서 소멸한다. 이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dx가 x에 비하여 아무것도 아니고 dy가 y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dx/dy는 내적이고 질적인 관계이며, 이 관계는 특수적인 규정성을 띠지 않는다. 하지만 거기에는 여전히 상이한 형식[범함수]과 방정식들에 상응하는 변이의 등급들이 있다. 이 등급들은 그 자체로 보편자의 비율적 관계들과 같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미분비들은 가변 계수들의 상호 의존성을 번역하고 있는 어떤 상호적 규정의 절차 안에서 파악된다. 그러나 여전히 상호적 규정은 오로지 진정한 이유율의 첫 번째 측면만을 표현한다. 이 원리의 두 번째 측면은 완결된 규정이다. 왜냐하면 한 함수의 보편자로 취해진 각각의 등급이나 비율적 관계는 해당 곡선상의 특이점들의 실존과 할당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서 '완결된 것'과 '전체적인 것'을 혼동하지 않도록 무척 조심해야 한다. 예를 들면 곡선 방정식에서 미분비는 곡선의 본성에 의해 규정되는 어떤 직선들만을 가리킨다. 그것은 이미 대상에 대한 완결된 규정이지만, 대상 전체의 일부분, 곧 '도함수로' 간주되는 부분만을 표현한다.(이른바 원시함수에 의해 표현되는 나머지 부분은 적분에 의해서만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적분은 결코 미분의 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선행적으로 규정된 특이점들의 본성을 정의하는 것은 적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대상은 완결된 형태 -모든 방식으로 규정되는 실재-로 규정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에 대한 적분 -그것의 현실적 실존을 구성하는 유일한 절차인 적분-에 의존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상호적 규정과 완결된 규정이라는 이중의 측면에서 볼 때, 이미 극한은 거듭제곱의 역량 자체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극한은 수렴에 의해 정의된다. 한 함수의 수치들이 지닌 극한은 미분비에 있다. 미분비들의 극한은 변이의 등급들에 있다. 그리고 각각의 등급에서 특이점들은 급수[계열]들의 극한인데, 이 급수들은 서로의 안에서 해석적으로 접속되고 확장된다. 미분적 관계, 곧 미분비는 누승적 잠재력의 순수한 요소이다. 뿐만 아니라 극한은 연속체의 역량이며, 마찬가지로 연속성은 극한들 자체의 역량이다. 그래서 차이는 어떤 부정적인 것 안에서 자신의 개념을 발견한다. 하지만 이것은 순수한 제한을 뜻하는 부정, 어떤 상대적인 무이다. 이런 모든 관점에서 볼 때, 연속체 안에는 비본질적인 것에 고유한 두 가지 범주가 있다. 이 두 범주는 특이한 것과 평범한 것, 혹은 독특한 것과 규칙적인 것의 구별을 통해 형성된다. 이 범주들을 통해 한계와 부수적 속성들에 대한 모든 언어가 활성화되고, 현상들 자체의 구조가 구성된다.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우리는 철학이 경험을 기술하기 위해서 특이점과 평범한 점들의 분배로부터 기대해야만 하는 모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미 그 두 종류의 점들을 통해 본질들 자체가 비본질적인 것 안에서 구성되는 과정이 예비, 규정되고 있다. 여기서 비본질적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다. 비본질적인 것은 오히려 가장 심층적인 것, 보편적인 질료나 연속체를 가리키며, 궁극적으로는 본질들 자체를 형성하고 있는 어떤 것을 가리킨다.
사실 라이프니츠의 입장에서는 연속성의 법칙과 식별 불가능자들의 원리 사이에 결코 모순이 성립하지 않는다. 연속성의 법칙은 부수적 속성들, 변용들, 혹은 완결된 경우들을 지배한다. 식별 불가능자들의 원리는 본질들, 곧 전체를 이루는 개체적 기초개념들로 파악되는 본질들을 지배한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이 전체를 이루는 기초개념들(모나드들) 각각은 세계의 총체성을 표현한다. 하지만 정확히 특정한 미분적 관계를 통해, 그리고 그 관계에 대응하는 특정한 특이점들 주위에서 표현한다. 이런 의미에서 미분비와 특이점들은 이미 연속체 안에서 어떤 봉인의 중심들을 지시한다. 그것들은 개체적 본질들에 의해 실행되는 함축과 퇴축의 가능한 중심들을 가리키고 있다. 이 점을 위해서는 변용과 부수적 속성들의 연속체가 특정한 방식으로 개체적 본질들의 구성에 권리상 선행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는 결국 특이점들이 그 자체로 전-개체적인 독특성들이라고 말하는 셈이 된다. 그리고 이는 개체화가 현실적 종별화에 선행한다는 생각과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 하지만 물론 개체화에 앞서 모든 미분적 연속체가 성립해야 한다.)이런 조건은 라이프니츠 철학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충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모나드들은 공통적으로 세계를 표현하고 있지만, 세계는 자신의 표현들보다 앞서 실존한다. 그런데 세계는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의 바깥에서, 곧 모나드들 자체의 바깥에서는 진정 실존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표현들이, 표현되고 있는 세계에 관계하는 방식이 특이하다. 자신들의 구성 요건에 관계하는 양 그것에 관계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라이프니츠가 아르노에게 보낸 편지에서 줄곧 상기시키는 것처럼) 술어들이 각각의 주어[기체]에 내재하기에 앞서 이 모든 주어들에 의해 표현되는 세계의 공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신은 죄인 아담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먼저 아담이 죄를 지은 세계를 창조했다. 물론 각각의 세계의 공가능성을 정의하는 것은 연속성일 것이다. 그리고 만일 실재 세계가 최선의 세계라면, 이는 그것이 최대의 경우들 안에서 최대의 연속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그 세계는 최대의 관계들과 최대의 특이점들 안에서 최대의 연속성을 보여준다. 이는 다음의 두 가지 점을 의미한다. 먼저 각각의 세계에 대해 어떤 하나의 특이점 주위로 수렴하는 한 계열은 어느 방향으로든, 다른 점들 주위로 수렴하는 다른 계열들 안으로 접속될 수 있다. 반면 세계들의 비-공가능성은 획득된 계열들을 발산하게 만들 특이점들의 근방에서 정의된다. 여기서 비-공가능성의 개념이 결코 모순으로 환원되지 않으며 또한 실재적 대립마저 함축하지 않는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즉 비-공가능성이 함축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발산뿐이다. 또 공가능성은 해석적 확장과 접속에 해당하는, 부차모순의 독창적인 과정만을 번역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공가능한 세계라는 연속체 안에서 미분비와 특이점들은 표현적 중심들(개체적 본질이나 개체적 실체들)을 규정한다. 그 중심들 안에서 세계 전체는 매번 어떤 특정한 관점을 통해 봉인된다. 거꾸로 이 중심들은 전개되고 개봉되기도 한다. 중심들은 세계를 복구하면서, 그리고 표현된 연속체 안에서 그들 스스로 단순한 특이점과 '경우들'의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개봉된다. 여기서 연속성의 법칙은 세계가 지닌 부수적 속성이나 경우들에 대한 법칙으로 드러난다. 그것은 표현되고 있는 세계뿐 아니라 세계 안의 모나드들 자체에 적용되는 개봉과 전개의 법칙이다. 반면 식별 불가능자들의 원리는 본질들에 대한 원리이다. 그것은 표현들, 다시 말해서 모나드들, 그리고 모나드들 안의 세계에 적용되는 봉인의 원리이다. 두 언어는 끊임없이 서로를 자신 안으로 번역하고 있다. 그 둘은 모두 차이 -무한하게 작은 동시에 유한한 차이- 를 근거로서의 충족이유에 관계짓는다. 이 충족이유는 선별의 근거이다. 다시 말해서 최선의 세계를 선택하는 근거이다. 이런의미에서 모든 세계들 중에서 가장 좋은 세계라는 것은 당연히 어떤 비교를 함축한다. 하지만 여기서 최선은 비교급의 최선이 아니다. 각 세계는 무한하므로, 그것은 차이를 절대적 최대치에까지 이끌어가는 최상급이다. 최선의 세계는 무한하게 작은 것의 시험에서도 여전히 차이를 절대적 최대치에까지 실어 나른다. 모나드 안에서 유한한 차이는 명석하게 표현된 세계의 영역으로 규정된다. 이런 두 가지 방식을 통해 망아적 재현은 규정을 매개하고, 그 규정을 차이의 개념으로 만든다. 망아적 재현은 매개된 규정에 하나의 '이유'를 지정해주는 가운데 규정을 차이의 개념으로 만든다. p.122-128
차이의 사유를 본질들의 단순한 유비나 부수적 속성들의 단순한 상사성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데는 역부족인 것이다. 왜 그런가? 이는 결국 마지막에 가서 무한한 재현은 재현의 전제 조건인 동일률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라이프니츠에거서 무한한 재현은 여전히 계열들의 수렴이라는 조건에 굴복한다. 무한한 재현은 근거를 끌어들인다. 근거는 물론 동일자 자체는 아니다. 하지만 역시 근거를 끌어들인다는 것은 동일률을 각별히 중시하는 한 가지 방식이다. 그것은 동일률에 어떤 무한한 가치를 부여하는 방식, 동일률을 전체와 통하도록 만들고 그럼으로써 실존 자체 위에 군림하도록 만드는 한 가지 방식이다. 동일성이 무한소의 관점에서 분석적인 것으로 파악되는지, 아니면 무한대의 관점에서 종합적인 것으로 파악되는지의 여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전자의 경우 충족이유, 곧 근거는 동일성과 부차모순을 이루는 것에 해당한다. 후자의 경우 근거는 동일성과 모순을 이루는 것에 해당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충족이유, 곧 근거가 무한을 통해 하는 일은 딱 한 가지뿐이다. 그것은 동일자를 자신의 동일성 자체 안에서 실존하도록 인도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 점은 라이프니츠의 경우 분명하지만, 헤겔에게서도 그에 못지않게 분명하다. 헤겔적 모순은 동일성이나 비-모순을 부정하지 않는다. 거꾸로 그 모순의 본성은 실존하는 것 안에 비-모순의 두 가지 비를 기입하는 데 있다. 이런 조건 아래, 그리고 이런 정초 작업 안에서 동일성은 본래적으로 실존하는 것을 충분히 사유하기에 이른다. "사물은 자신이 아닌 것을 부정한다."라던가 "사물은 자신이 아닌 모든 것과 구별된다."라는 공식은 동일성에 봉사하는 논리적 괴물(그 사물이 아닌 바의 전체)이다. 차이는 부정성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또 차이는 마지막까지 밀려나가면 모순으로까지 나아가거나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참이라면, 이는 오로지 차이가 이미 어떤 길 위에, 동일성이 당기고 있는 끈 위에 놓여 있을 때뿐이다. 그 말은 차이를 거기까지 밀고 가는 것이 동일성인 한에서만 참일 수 있다. 여기서 차이는 바탕이지만, 동일자가 출현하기 위한 바탕일 뿐이다. 헤겔의 원환은 영원회귀가 아니다. 다만 부정성을 통한 동일자의 무한한 순환일 뿐이다. 헤겔의 대담성은 낡은 원리에 대해 표하는 최후의, 그리고 가장 강렬한 경의이다. 라이프니츠와 헤겔 사이에서는 차이에 대해 가정된 부정성이 부차모순적 제한으로 사유되는지, 아니면 모순적 대립으로 사유되는지의 여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무한한 동일성 그 자체가 분석적인 것으로 정립되는지, 아니면 종합적인 것으로 정립되는지의 여부도 중요하지 않다. 어쨌든 차이는 여전히 동일성에 종속되어 있다. 차이는 부정적인 것으로 환원되고 있으며, 상사성과 유비 안에 갇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한 재현 안에서 광기는 미리 형성된 광기, 동일자의 휴식과 평온을 전혀 깨뜨리지 못하는 거짓 광기에 불과하다. 따라서 무한한 재현은 유한한 재현과 똑같은 결함을 지닌다. 그 결함은 차이의 고유한 개념을 차이의 기입과 혼동하는 데 있다. 개념 일반의 동일성 안으로 차이를 기입하는 것과 혼동하는 것이다.(비록 무한한 재현이 동일성을 유로 파악하는 대신 무한하고 순수한 원리로 파악하고, 개념 일반의 권리 범위를 한정하는 대신 전체로 확대한다 하더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p.129-130
이 깊이야말로 공간 전체의 모태이자 차이의 일차적 긍정이다. 그 안에는 어떤 것이 자유로운 차이들의 상태로 살아 우글거리고 있다. 그것은 오로지 그 다음 단계에서만 선형적 제한과 평면적 대립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어디서든 짝과 분극성들은 어떤 묶인 다발과 그물망들을 전제한다.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대립들은 전방위적으로 퍼져 나가는 어떤 방사들을 가정한다. 매우 다른 방식을 통해서이지만, 이 이미지들이 최종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층을 이루며 상호 공존하는 변동적 평면들, 원천적 깊이 안의 어떤 '불균등화'이다. 어디서든 차이의 깊이가 일차적이다. 그리고 이 갚이를 삼차원적인 것으로 재발견하더라도, 애초에 그것이 다른 두 차원을 봉인하고 있으며 다시 자기 자신을 삼차원으로 봉인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시간과 공간은 오로지 표면에서만 대립들(그리고 제한들)을 드러낸다. 그러나
차이는 대립을 가정하지 않는다. 대립을 가정하는 것이 차이가 아니라 차이를 가정하는 것이 대립이다. 그리고 대립은 차이를 해소하기는 커녕, 다시 말해서 근거로까지 끌고 가기는커녕, 차이를 왜곡하고 변질시킨다. 우리는 즉자적 차이 그 자체가 '이미' 모순이 아님을 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나아가 차이는 모순으로 환원되거나 소급되는 것이 아님을 또한 말하고 있다. 모순은 깊이가 얕고 차이만큼 깊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조건에서 차이는 어떤 평면적 공간으로 인도되고 그 평면에 투사되는가? 정확히 그것은 차이가 미리 설정된 어떤 동일성 안에, 동일자의 경사면 위에 강제로 놓일 때이다. 이 경사면에 의해 차이는 필연적으로 동일성이 원하는 곳으로 끌려가게 되고 동일성이 원하는 곳 안에, 다시 말해서 부정적인 것 안에 반영된다. [정신현상학]의 초두에서 헤겔의 변증법이 벌이는 손장난은 종종 주목의 대상이 되어왔다. 즉 지금과 여기는 텅 빈 동일성, 추상적 보편성으로 정립되며, 이것들은 자신과 함께 차이를 끌고 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차이는 분명 따라가지 않고 있다. 다만 여전히 자신의 고유한 공간의 깊이 안에 걸려 있고, 언제나 독특성들로 이루어진 어떤 변별적 실재의 지금-여기에 붙들려 있다. 종종 지적되는 것처럼, 운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고자 하는 사상가들이 있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운동은 여전히 계속 일어나고 있다. 헤겔의 경우 사정은 반대이다. 그는 운동을 만들며, 무한자의 운동까지도 만들어낸다. 그러나 말과 재현들을 통해 만들기 때문에 그 운동은 거짓 운동이며, 그것으로부터는 아무것도 따라 나우지 않는다. 매개 또는 재현이 등장할 때는 매번 그런 일이 벌어진다. 재현하는 자는 말한다. "모든 사람은 ......을 알아보고 재인한다." 그러나 재현되지 않는 어떤 독특성은 항상 있기 마련이다. 독특성의 주체는 알아보거나 재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정확히 모든 사람이나 보편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보편자를 알아보고 재인한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보편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말하자면 심층적이고 감성적인 의식인 독특성의 주체는 보편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간주된다. 말하기의 불행은 말하기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말한다는 데 있으며, 혹은 무언가를 재현한다는 데 있다. 감성적 의식(다시 말해서 어떤 사태, 차이나 다름)은 완고하게 버티고 있다. 매개하고 반정립으로 이행하며 종합을 이루어내는 것이 언제나 가능한지도 모른다. 그러나 테제는 뒤따라 나오지 않는다. 테제는 다만 자신의 직접성 안에, 그 자체로 참된 운동을 만들어내는 자신의 차이 속에 존속한다. 차이는 테제의 참된 내용, 테제의 고집이다. 부정적인 것, 부정성은 차이의 현상을 붙들지조차 못한다. 다만 차이의 환영이나 부대 현상만을 받아들일뿐이다. 모든 정신현상학은 부대현상학이다.
가상으로서의 부정적 사태
차이의 철학이 거부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모든 규정은 부정이라는 명제이다. 여기서는 무한한 재현의 일반적 양자택일이 거부된다. 이 양자택일의 한쪽에는 규정되지 않은 것, 무차별하거나 무관심한 것, 분화되지 않은 것이 있다. 다른 한쪽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이미 부정으로 규정된 차이, 부정적인 것을 함축하고 봉인하고 있는 차이다.(이를 통하여 특수한 양자택일 역시 거부된다. 여기서 선택지는 제한의 부정성과 대립의 부정성이다.) 차이는 본질적으로 긍정의 대상, 긍정 자체이다. 긍정은 본질적으로 그 자체가 차이다. 그러나 여기서 차이의 철학이 새로운 형태의 아름다운 영혼으로 드러날 우려는 없는가? 사실 아름다운 영혼은 도처에서 어떤 차이들을 발견하고 불러들인다. 하지만 역사가 피비린내 나는 모순들을 이용하여 끊임없이 생성하는 곳에서 그가 불러들이는 것은 존중해줄만하고 화해시킬 수 있으며 연합 가능한 차이들이다. 아름다운 영혼은 전쟁터에 내던져진 평화의 심판자인 것처럼 처신한다. 용서 없는 싸움에서 의견 차이로 인한 단순한 '분쟁'이나 차라리 오해로 빚어지는 갈등만을 보려는 것이다. 하지만 거꾸로 아름다운 영혼에게 순수한 차이들에 대한 취향을 일깨워보자. 그리고 실재적 차이들의 운명을 부정이나 모순의 운명과 하나로 만들어보자. 이를 위해서는 얼른 굳은 표정을 하고 긍정과 부정, 삶과 죽음, 창조와 파괴 사이에는 상호 보충관계가 있다는 상식적인 이야기 -마치 그것들이 어떤 부정성의 변증법을 근거짓기에 충분하기라도 한 듯 내세우는 이야기- 를 꺼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런 보충관계들을 안다고 해서 한 항이 다른 항과 맺는 관계를 알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기 때문이다.(규정된 긍정은 이미 부정적이고 부정하는 차이의 결과인가, 아니면 부정이 이미 변별적 차이를 띠는 긍정의 결과인가?) 아주 일반적으로 우리는 '필연적 파괴'를 불러들이는 두 가지 방식이 있음을 말한다. 먼저 창조적 역량의 이름으로 말하는 시인의 방식이 있다. 이 역량은 모든 질서와 모든 재현을 전복하는 가운데 본연의 차이 자체를 긍정하기에 이른다. 영원회귀라는 영구 혁명 상태에 있는 차이를 긍정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 정치가의 방식이 있다. 이 방식은 우선 일탈적인 것, '차이나는' 것을 부정하는 데 관심을 기울인다. 이는 역사 안에서 확립된 질서를 보존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혹은 이미 세상에서 자신의 재현 형식들을 부추기고 있는 역사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이다. 격동기에 이 두 방식은 일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결코 같은 것이 아니다. 니체에 비한다면 누구나 아름다운 영혼으로 통할 수 있다. 그의 영혼은 극단적으로 아름답지만 아름다운 정신이라는 의미에서 그런 것은 아니다. 니체만큼 잔혹성의 감각, 파괴의 취향을 갖기도 힘들다. 그러나 니체 자신은 자신의 모든 저작에서 끊임없이 긍정-부정의 관계에 대한 두 가지 생각을 대립시킨다.
첫 번째 생각에 따르면, 부정은 확실히 발동 장치이자 역량이다. 긍정은 그것의 결과, 말하자면 대용품이다. 또 긍정의 환영, 긍정의 대용품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아마 두 개의 부정은 너무 많은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만일 부정되는 것이 보존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긍정이 부정으로부터 귀결될 수 있겠는가? 니체 역시 그런 발상법에 젖어 있는 무시무시한 보수주의에 주목하고 있다. 여기서도 물론 긍정은 산출된다. 그러나 그 산출은 부정적이고 부정하는 모든 것, 부정될 수 있는 모든 것에 "예."라고 말하기 위함이다. 차라투스트라의 당나귀는 바로 그런 식으로 "예."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에게 긍정한다는 것은 짊어지고, 떠맡고, 감당한다는 것이다. 당나귀는 모든 것을 짊어진다. 사람들이 그에게 지우는 짐들(신적 가치들)을, 그 스스로 떠맡는 짐들(인간적 가치들)을, 그리고 짊어질 것이 더 이상 없을 때는 자신의 피로해진 근육의 무게(가치들의 부재)를 짊어진다. 이 당나귀나 변증법적 황소에게는 책임감을 향한 지독한 취향과 도덕적 향수가 있다. 이를 보면 마치 속죄에 기대서만 긍정할 수 있는 듯 하고, "예."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분열과 찢김의 불행들을 통과해야만 할 것처럼 보인다. 마치 본연의 차이 자체가 악이고 또한 부정성을 띠고 있어서, 오로지 속죄할 때만, 다시 말해서 부정된 것과 부정 자체의 무게를 동시에 감당할 때만 긍정을 산출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동일률의 꼭대기에서부터 울리고 있는 오래된 저주는 언제나 이렇게 말하고 있다. 단순히 재현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 차이를 마침내 동일자에게 되돌려주기 위해 부정성을 띤 모든 것을 보존하는 무한한 재현(개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지양이 지닌 모든 의미 가운데 들어 올린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없다. 물론 변증법의 원환을 꼽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그 무한한 원환은 어디서든 단 하나의 중심만을 지닌다. 이 중심을 통해 무한한 원환은 다른 모든 원환들과 다른 모든 일시적인 중심들을 자신 안에 붙들어둔다. 변증법적 되풀이나 반복들이 표현하는 것은 단지 전체의 보존일 분이다. 이 반복들을 통해 모든 형태들과 모든 계기들이 하나의 거대한 기억 안에 보존된다. 무한한 재현은 보존하는 기억이다. 반복은 거기서 기억 자체의 박물관, 기억 자체의 역량에 불과하다. 변증법의 순환적인 선별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항상 무한한 재현 안에 보존되는 것에 유리한 선별이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짊어지는 자와 짐이 된자를 위해 봉사하는 선별이다. 원환을 일그러지게 만들거나 기억내용의 투명성을 깨뜨리는 것에 대해서 그 선별은 반대 방향으로 기능하고 또 가차없이 그들을 제거한다. 마치 동굴의 그림자들과도 같이 짊어지는 자와 짐이 된 자는 무한한 재현 안으로 끊임없이 들어갔다 나오고 다시 들어간다. 그리고 이들은 마침내 고유한 의미의 진정한 변증법적 역량을 떠맡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p.133-138
부정적인 것의 배제와 영원회귀
그러나 다른 발상법을 따른다면 긍정이 일차적이다. 긍정은 차이, 거리를 긍정한다. 차이는 가벼운 것, 공기 같은 것, 긍정적인 것이다. 긍정한다는 것은 짐을 짊어진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거꾸로 짐을 던다는 것, 가볍게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더 이상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 부정적인 것은 긍정의 환영, 대용품 같은 환영만을 산출한다. 긍정에서 따라 나오는 것은 "아니요."이다. 이것은 다시 그림자이지만, 그러나 차라리 귀결이라는 의미의 그림자이다. 후속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부정적인 것, 그것은 부대 현상이다. 연못 안에서 볼 수 있는 [안개나 운무 같은] 현상처럼, 부정은 너무나 강하고 너무나 차이나는 긍정의 효과이다. 부정이라는 그림자를 후속으로 산출하기 위해서는 아마 두 개의 긍정이 필요할 것이다. 또 거기에는 아마 두 국면이 있을 것이다. 그 두 국면은 본연의 차이로서, 그림자조차 사라지는 자정이나 정오와 같다. 이런 관점에서 니체는 당나귀의 "예."와 "아니요."를 디오니소스-차라투스투라의 "예."와 "아니요."에 대립시킨다. 이는 두 가지 관점의 대립이다. 그것은 "아니요."로부터 긍정의 환영을 끌어내는 노예의 관점, 그리고 "예."로부터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귀결을 끌어내는 '주인'의 관점 -오래된 가치를 지키는 보수주의자들의 관점과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창조자들의 관점- 사이의 대립이다. 니체가 주인이라고 부르는 자들은 분명 역량을 지닌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권력을 지닌 사람은 아니다. 왜냐하면 권력은 현행 가치들의 귀속 관계에 의해 판정되기 때문이다. 노예가 권력을 잡는다고 해서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노예들은 세계의 운행 법칙이나 세계의 표면 법칙마저 주도하는 위치에 있다. 게다가 확립된 가치들과 창조 사이의 구별을 역사적 상대주의의 관점에서, 가령 확립된 가치들이 당시에는 새로운 것이었으며 새로운 가치도 적당한 때에 이르러 확립된 가치로 자리잡으리라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확립된 가치들과 창조 사이에는 오히려 재현의 보수적 질서와 창조적 무질서 사이에서처럼 본성적 차이가 있다. 가령 창조적 카오스는 역사의 한 순간과 일치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그 순간과 혼동되는 일은 결코 없다. 가령 창조적 카오스는 역사의 한 순간과 일치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그 순간과 혼동되는 일은 결코 없다. p.139-140
영원회귀의 독창성은 기억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낭비에 있고 능동성을 띠게 된 망각에 있다. 부정성을 띤 모든 것, 부정하는 모든 것, 부정적인 것을 짊어지고 있는 모든 평균적 긍정, "아니요."에서 비롯하고 잘못 빠져 들고 있는 모든 창백한 "예.", 영원회귀의 시험을 견뎌내지 못하는 모든 것, 이런 것들은 모두 부정되어야 한다. 만일 영원회귀가 어떤 바퀴라면, 이 바퀴는 또한 폭력적인 원심 운동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운동을 통해 부정'될 수' 있는 모든 것, 시험을 견뎌 내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축출되어야 한다. 니체는 영원회귀를 '믿지 않을' 사람들에게 가벼운 처벌만을 통고한다. 즉 그들은 단지 덧없는 삶만을 느끼고 그런 삶만을 살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느끼고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이 부대 현상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앎이 그들이 말하는 절대지일 것이다. 그래서 귀결로서의 부정은 충만한 긍정의 결과로 따라나오고, 부정적인 모든 것을 소진시키며, 그 스스로 영원회귀의 움직이는 중심에서 소진된다. 왜 그런가? 만일 영원회귀가 어떤 원환이라면, 그 중심에 있는 것은 본연의 차이이며, 같음은 단지 가장자리에 있을 분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매 순간 중심을 이탈하고 끊임없이 일그러지는 원환으로서, 단지 비동등성의 주의만을 맴돌고 있다.
부정은 차이다. 그러나 작은 쪽에서 본 차이, 낮은 곳에서 본 차이다. 이와 거꾸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다시 바로 세워놓고 보면, 차이는 긍정이다. 하지만 이 명제는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가령 차이는 긍정의 대상이라는 것, 긍정 자체는 다양체의 성질을 띤다는 것, 긍정은 창조라는 것, 그뿐 아니라 긍정은 창조되어야 한다는 것 등을 의미한다. 긍정은 차이를 긍정하는 긍정으로, 그 자체가 차이인 긍정으로 창조되어야 한다. 부정적인 것은 결코 발동 장치가 아니다. 오히려 실증적인 미분적 요소들이 있을 뿐이며, 바로 이것들이 긍정의 발생과 긍정된 차이의 발생을 동시에 규정한다. 우리는 그런 긍정의 엄연한 발생을 놓치기 쉽다. 긍정을 규정되지 않은 것 속에 방치한다든가 규정을 부정적인 것 속에거 구할 때마다 우리는 그 발생을 간과하게 된다. 부정은 긍정의 결과이다. 이는 부정이 긍정에 뒤이어 나오거나 긍정의 옆쪽에서 출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부정은 보다 심층적인 발생적 요소의 그림자로서만 출현할 분이다. 부정은, 긍정을 분만하고 긍정 안에 차이를 분만하는 역량이나 '의지'의 그림자이다. 부정적인 것을 짊어지고 있는 자들은 자신이 무엇을 행하는지 안ㄹ지 못한다. 그들은 그림자를 실재인 줄 알고, 환영들을 양육하고 있다. 그들은 전제들로부터 귀결을 잘라내고, 부대 현상에 현상과 본질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p.141-142
*주 49 - 이전까지의 니체 해석을 쇄신한 두 논문에서 클로소브스키는 이 요소를 끌어냈다. "신은 죽었다는 실존을 해명하는 신성의 역할이 종식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니체의 의식의 지평에서 책임 있는 자아의 동일성에 대한 절대적 보증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니체의 의식은 이러한 소멸과 하나가 된다. .....(이 의식에 대해) 자신의 동일성 자체도 필연적으로 임의적으로 유지되는 어떤 우연한 사태임이 선언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의식 자체가 우연의 보편적 수레바퀴로 간주되는 것을 괘념치 않으며, 가능하다면 사태들의 총체성을 끌어안는 것을 괘념치 않는다. 우연한 것 자체를 필연적 총체성 안에서 글어안는 것이다. 그러므로 존속하는 것은 존재이며, '존재하다'라는 동사는 존재 자체에는 결코 적용되지 않고 다만 우연한 것에 적용된다." "이는 사유하는 주체가 자신을 배제하는 어떤 일관된 사유에 따라 동일성을 상실한다는 것을 의미하는가?......자아를 비일관적이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순환적 운동 안에서 자아의 몫은 어디에 있는가? 왜냐하면 이 사유는 너무도 완벽한 일관성을 띠어서 자아는 그것을 생각하는 순간조차 그 사유로부터 배제되기 때문이다. .....이 사유는 어떻게 자아의 현실성에 타격을 가하는가? 왜냐하면 그 사유는 동시에 자아를 고양하기 때문이다. 이 사유는 자아를 의미하는 유동적 사태들을 해방하지만, 이 자아의 현재 안에 공명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이미 경과된 것일 뿐이다. 여기서 신적인 악순환이라느 것은 디오니소스를 모델로 어떤 신의 모습을 취하는 이런 기호에 대한 명명일 뿐이다."p. 147-148
그리고 개념 안에 가정된 동일성과 비교하면, 나눔은 사실 어떤 변덕스럽고 일관되지 못한 절차이다. 하나의 독특성에서 다른 하나의 독특성으로 도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데아의 관점에서 볼 때, 그 방법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나눔의 방법은 다른 변증술적 절차들 가운데 있는 하나의 절차가 아니고, 그렇기에 다른 절차들에 의해 보완되거나 대체되어야 할 필요도 없다. 그것은 오히려 다른 모든 절차들을 대체하는 과정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닐까? 나눔의 방법은 진정한 차이의 철학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모든 변증술적 역량을 집약하는 기법, 그래서 플라톤주의와 플라톤주의의 전복 가능성을 동시에 가늠하는 기법이 아닐까? p.149-150
어떤 점에서 지망자들은 당선 경쟁의 질서에 따라 측정되고 있다. 그리고 정치적 경쟁자들 가운데 부모, 하인, 조수, 마침내는 사기꾼, 위선자 등을 (신화에 의해 제시된 이런 존재론적 척도에 따라)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파이드로스]에서도 마찬가지의 행보를 볼 수 있다. '광기들'을 구별하는 문제에 이르러 플라톤은 갑자기 어떤 신화를 끌어들인다. 그는 육체로 들어오기 이전의 영혼들의 순회를 기술하고, 이데아들 -영혼들이 관조할 수 있었던 이데아들- 에서 비롯되는 기억내용을 기술한다. 서로 다른 유형의 광기들에 대하여 그 가치와 순서를 결정하는 것은 이런 신화적 관조이다. 그 가치와 순서는 그런 관조의 본성이나 등급에 의해, 회상에 필요한 기회들의 종류에 의해 결정된다. 즉 우리는 누가 가짜 연인이고 누가 진짜 연인인지 규정할 수 있다. 우리는 연인, 시인, 목사, 점쟁이, 철학자 중에서 누가 경쟁적으로 상기와 관조에 참여하는지 -누가 참된 지망자이고 참된 참여자인지, 그리고 다른 인물들은 어떤 순서로 놓이는지- 규정할 수 있다. (나눔에 관련된 세 번째의 위대한 텍스트 [소피스트]에서는 어떠한 신화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반박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 나눔의 방법은 역설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말하자면 어떤 반대-사용법을 통해 플라톤은 탁월한 가짜 지망자를 고립시키고자 한다. 아무런 권리도 없이 모든 곳에 지망하는 그 가짜 지망자는 '소피스트'이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든 반론들은 이렇게 도입된 신화 때문에 더욱 견고해지는 것처럼 보인다. 즉 나눔은 매개를 결여하고 있으므로 전혀 설득력이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자신의 임무를 신화에 넘겨주어야 했을 것이다. 신화는 상상적 형태로 나눔의 방법에 매개의 등가물을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우리는 그토록 신비로운 이 나눔의 방법이 지닌 의미를 왜곡하고 있다. 확실히 신화와 변증술은 플라톤 사상 전반에 걸쳐 서로 구별되는 두 가지 힘이다. 하지만 변증술이 나눔 안에서 자신의 진정한 방법을 발견하는 순간 이 구별은 가치를 상실한다. 나눔은 그런 이분법을 극복하고 있다. 나눔을 통해 신화는 변증술 안에 통합되고 변증술 자체의 한 요소로 바뀌게 된다. 플라톤에게서 신화의 구조는 명료하게 드러난다. 즉 그것은 원환적이다. 이 원환은 회전과 복귀, 분배 또는 할당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 두 가지 역동적인 기능을 갖는다. -윤회가 영원회귀에 속하는 것처럼, 운명들의 할당은 회전하는 바퀴에 속한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플라톤이 확실히 영원회귀의 주창자가 아닌 이유들에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가]나 다른 대화편에서와 마찬가지로 [파이드로스]에서도 신화는 여전히 어떤 부분적인 순환의 모델을 만들어 놓고 있다. 이 모델 안에서는 차이를 만드는 데 적합한 어던 근거, 다시 말해서 역할이나 지망자들을 측정하는 데 적합한 근거가 등장한다. [파이드로스]에서 이 근거는 이데아들 -천상을 순회하는 영혼들에 의해 관조되는 이데아들- 의 형태로 규정되고 있다. [정치가]에서 그 근거는 우주의 순환 운동을 주재하는 목자-신의 형태로 규정되고 있다. 원환의 중심이나 발동 장치에 해당하는 근거는 신화에서 어떤 시험이나 선별의 원리로 설정된다. 이 원리는 당선 경쟁의 등급들을 고정시키고, 이로써 나눔의 방법에 그 모든 의미를 부여해준다. 따라서 원환적 구조의 신화는 어떤 정초 작업의 반복-서사이고, 이는 가장 오래된 전통과 일치한다. 나눔은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근거로서 원환적 구조의 신화를 요구하고 있다. 거꾸로 신화는 근거지어져야 하는 것 안에 있는 차이의 상태로서 나눔을 요구하고 있다. 나눔은 변증술과 신화학의 진정한 통일이다. 나눔 안에서는 정초로서의 신화와 나누는 말로서의 로고스가 하나를 이루고 있다.
근거가 지닌 이런 역할은 플라톤의 분유 개념에서 아주 명쾌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이 근거는 나눔의 방법에 결여된 것처럼 보이던 매개를 제공하고, 또 동시에 차이를 일자에 관계짓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과정은 매우 각별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분유한다는 것은 차지한다는 것을, 이후에 이차적으로 차지한다는 것을 뜻한다. 일차적으로 소유하는 것, 그것은 근거 자체이다. 플라톤은 단지 올바름만이 올바르다고 말한다. 올바르다고 불리는 자들에 대해 말하자면, 그들은 올바를 자질을 소유하되 다만 이차적으로, 삼차적으로, 사차적으로...... 혹은 허상으로서 소유한다. 단지 올바름만이 올바르다는 것은 단순한 분석 명제가 아니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소유하는 근거인 이데아를 지칭한다. 그리고 근거의 고유한 본성은 분유의 기회를 준다는 것, 이차적으로 준다는 것에 있다. 그래서 분유하는 자, 상이한 정도들로 더나 덜 분유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어떤 경쟁적 지망자가 된다. 근거에 호소하는 자는 지망자이다. 근거를 지녀야 하는(혹은 근거가 업삳고 비난받는 ) 것은 경쟁적 지망이다. 지망은 다른 현상들 가운데 있는 한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현상의 본성이다. 근거는 어떤 시험이며, 이 시험을 통해서 지망자들에게 지망 대상을 더나 덜 분유할 기회가 주어진다. 근거가 차이를 측정하고 만들어낸다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구별이 필요하다. 먼저 올바름이 있고, 이것은 근거이다. 다음으로 올바른 자질이 있고, 이것은 근거짓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지망 대상이다. 마지막으로 올바를 자들이 있고, 이들은 그 대상을 동등하지 않게 분유하는 경쟁적 지망자들이다. 이 점에 기대어 보면 신플라톤주의자들이 얼마나 심오하게 플라톤 사상을 이해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들은 분유 불가능한 것, 분유되는 것, 분유자들로 이루어진 성스러운 삼항관계를 제시한다. 근거의 역할을 맡는 원리는 분유 불가능한 것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 원리가 분유자, 이차적 소유자, 다시 말해서 근거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지망자에게 분유할 어떤 것을 제공한다. 말하자면 아버지, 딸, 구혼자가 있다. 그리고 삼항관계는 분유들의 계열을 따라 재생산되고, 지망자들은 현실적 차이를 대변하는 어떤 순서와 등급들에 따라 분유한다. 이 점에서 신플라톤주의자들은 본질적인 것을 제대로 간파했다. 즉 나눔의 목표는 종들에 대한 수평적 구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어떤 계열적 변증술의 확립, 수직적 계열이나 계통의 확립에 있다. 이것들은 당선 경쟁적 분유는 물론이고 선별적 근거의 기능 방식들을 표시한다(제우스 1, 제우스 2 등등). 이제 모순은 근거 자체의 시험을 의미하기는커녕, 오히려 거꾸로 분유의 막바지에서 어떤 근거 없는 지망의 상태를 대변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올바른 지망자(일차적으로 근거지어진 자, 제대로 근거지어진 자, 참됨을 인증받은 자)에게는 여러 경쟁자들이 있다. 부모, 조수, 하인들 같은 이 경쟁자들이 상이한 지망 자격에서 선발 경쟁에 참여한다. 하지만 올바른 지망자에게도 역시 자신의 허상들, 위조된 가짜들이 있고, 이들도 시험에 의해 적발된다. 플라톤에 따르면 '소피스트', 어릿광대, 켄타우로스 혹은 사티로스 등이 그런 허상과 가짜들에 해당한다. 소피스트는 아무 데나 지망하고, 아무 데나 지망하면서도 결코 근거를 얻지 못하며, 모든 것과 모순을 이루고 자기 자신과도 모순에 빠진다......
하지만 근거의 시험은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를 말해주는 것은 신화이다. 신화는 언제나 완수해야 할 임무, 풀어야 할 수수께끼에서 시작한다. 사람들은 신탁에 대해 묻는다. 그러나 신의 대답은 그 자체로 하나의 문제이다. 변증술[문답법]은 반어이다. 그러나 반어는 문제와 물음들의 기술이다. 반어의 본성은 사물과 존재자들을 어떤 숨겨진 물음들에 대한 각각의 답변들로 간주하고, 어떤 해결할 문제들을 가리키는 각각의 경우들로 취급하는 데 있다. 플라톤의 정의에 따르면 변증술은 '문제들'에 힘입어 앞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이 문제들을 통해 근거의 역할을 맡는 순수한 원리로까지, 다시 말해서 문제들 자체를 본래대로 측정하고 해당의 해답들을 분배하는 순수한 원리로가지 상승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메논]은 오로지 기하학적 문제에 의존해서만 상기를 설명한다. 이 문제는 해결되기에 앞서 이해되어야 하며, 그에 대한 해답은 상기하는 자가 그 문제를 이해했던 방식이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지금 우리는 문제와 물음이라는 두 심급 사이에 설정할 만한 구분법에 신경 쓸 필요는 없다. 그보다는 오히려 그것들의 복합체가 플라톤적 변증술에서 본질적인 역할을 떠맡는 방식을 생각해야 한다. 이 역할은 그 중요ㅛ성에서 가령 나중에 헤겔의 변증법에서 부정적인 것이 떠맡는 역할에 견주어볼 만하다. 그러나 플라톤에게서 그 역할을 떠맡는 것은 분명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 이런 점에 주목할 대, [소피스트]의 유명한 테제는 몇몇 애매한 구석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인지 자문해야 한다. 즉 '비-존재'라는 표현에서 '비'는 부정적인 것과는 다른 어떤 것을 표현한다. 이 점에 관한 한 전통적 이론들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우리에게 어떤 의심스러운 선택지를 강요하기 때문이다. 이 선택지의 한편을 따르면, 부정적인 것을 몰아내고자 할 때, 우리는 존재가 충만하고 적극적인 실재성을 띠고 있고 어떠한 비-존재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만족스럽다고 선언한다. 다른 한편 거꾸로 부정에 근거를 마련하려 할 때, 우리는 존재 안에 혹은 존재와 관련하여 어떤 비-존재든 설정할 수만 있게 된다면 만족한다. (우리가 보기에 이 비-존재는 필연적으로 부정적인 것의 존재이거나 부정의 근거이다.) 따라서 선택지는 비-존재가 없거나 있는 두 경우로 나뉜다. 그래서 한편 비-존재는 없고 부정은 가상적이며 근거가 없다. 다른 한편 비-존재는 있고 이 비-존재는 존재 안에 부정적인 것을 위치시키며 부정의 근거가 된다. 하지만 우리는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비-존재는 있다. 그리고 동시에 부정적인 것은 가상적이다.
문제나 물음은 어떤 주관적 규정이 아니다. 인식에 있어 불충분성의 국면을 표시하는 어떤 결여적 규정도 아니다. 문제제기의 구조는 대상들의 일부를 이루고, 대상들을 기호들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이는 물음을 던지거나 문제를 설정하는 심급이 인식의 일부를 이루고, 배움의 행위 안에서 인식의 실증성과 특징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것과 전적으로 같다. 좀 더 심층적인 관점에서 말하자면, 바로 그와 같은 문제나 물음의 본질에 '상응'하는 것은 존재이다.(플라톤은 이데아라 했다.) 존재와 물음을 서로 관련짓는 어떤 존재론적인 '통로', '틈', '주름' 같은 것이 있다. 이런 관계에서 볼 때, 존재는 본연의 차이 그 자체이다. 존재는 도한 비-존재이기도 하다. 그러나 비-존재는 부정적인 것의 존재가 아니다. 그것은 문제틀의 존재, 문제와 물음의 존재이다. 본연의 차이 자체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 거꾸로 그것은 비-존재이고, 이 비-존재는 본연의 차이, 곧 반대가 아닌 다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존재는 차라리 (비)-존재라 적어야 하고, 그보다는 ?-존재라고 적는 편이 훨씬 낫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존재의 원형 동사 esse는 어떤 명제를 가리킨다기보다 그 명제가 대답한다고 간주되는 질문을 가리킨다. 이 (비)-존재는 변별적 차이 관계가 형성되는 지반이고, 이 본연의 지반 안에서 긍정 -다양체의 성격을 띠는 긍정- 은 자신의 발생 원리를 발견한다. 부정에 관해 말하자면, 그것은 어떤 그림자에 불과하다. 부정은 이런 상위 원리의 그림자, 이미 산출된 긍정 옆에 머물러 있는 차이의 그림자일 뿐이다, 우리가 (비)-존재를 부정적인 것과 혼동한다면, 모순은 불가피하게 존재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러나 모순은 여전히 겉모습이거나 부대 현상이다. 모순은 문제에 의해 투사된 가상, 열려 있는 어떤 물음의 그림자, (답이 주어지기 이전의) 이 물음과 소통하고 있는 존재의 그림자이다. 모순이 유독 플라톤에게서만은 이른바 아포리아적인 대화들의 상태를 특징짓는다면, 이는 그가 이미 이런 관점에서 보기 때문이 아닐까?모순의 저편은 차이다. 비-존재의 저편은 (비)-존재이고, 부정적인 것의 저편은 문제와 물음이다. p.153-159
즉 엄밀한 의미에서 영원회귀는 각각의 사물이 오로지 되돌아오는 가운데 실존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영원회귀는 사물이 무한히 많은 모사들의 모사이고, 때문에 원본도, 심지어 기원조차 계속 존속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영원회귀는 '패러디'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말해진다. 즉 영원회귀는 자신이 존재하게(그리고 되돌아오게) 만드는 것에 허상이라는 자격을 부여한다. 영원회귀가 존재(비형상적인 것)의 역량일 때, 허상은 존재하는 것 -'존재자'- 의 참된 특성 혹은 형상이다. 사물들의 동일성이 와해될 때, 존재는 거기서 빠져나와 일의성에 도달하며, 차이나는 것의 주위를 맴돌기 시작한다. 존재하는 것 혹은 되돌아오는 것은 결코 이미 구성된 선행의 동일성을 지니지 않는다. 사물은 자신을 갈가리 찢는 차이로 환원되고, 이 차이 안에 함축된 모든 차이들을 통과하며, 그 차이들로 환원된다. 이런 의미에서 허당은 상징 자체이다. 다시 말해서 허상은 자신의 고유한 반복 조건들을 내면화하는 기호이다. 허상은 사물로부터 원형의 지위를 박탈하지만, 그 사물 안에서 어떤 구성적 성격의 불균등성을 움켜쥐었다.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영원회귀의 기능은 평균적 형상과 우월한 형상들 사이에 어떤 본성상의 차이를 확립하는 데 있다.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영원회귀의 기능은 평균적 형상과 우월한 형상들 사이에 어떤 본성상의 차이를 확립하는 데 있다. 하지만 본성상의 차이는 영원회귀에 대한 평균적이거나 중도적인 이해들(부분적 순환 주기들, 혹은 대략적이고 근사한 형태의 회귀로 보는 관점)과 엄밀하거나 정언적인 이해 사이에도 역시 존재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역량 전체 안에서 긍정될 때 영원회귀는 어떠한 정초-근거의 성립도 결코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거꾸로 영원회귀는 근거 전체를 파괴하고 삼켜버린다. 근거는 원본과 파생물, 사물과 허상들 사이에 차이를 두는 심급이기 때문이다. 영원회귀를 통해 우리는 보편적인 근거와해를 목격하게 된다. p.162-163
우리는 재현을 그와는 다른 본성을 띤 어떤 형성 과정에 대립시켰다. 재현의 요소 개념들은 가능한 경험의 조건들로 정의되는 범주들이다. 그러나 범주들은 실재에 비해 너무 크다. 그물은 너무 성겨서 대단히 큰 물고기도 빠져나가 버린다. 그래서 감성론이 환원 불가능한 두 영역으로 쪼개진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렇게 쪼개진 한 영역은 감성적인 것에 대한 이론인데, 이 이론은 실재에서 오로지 가능한 경험과 합치하는 것만을 보존한다. 다른 한 영역은 미에대한 이론인데, 이 이론은 감성적인 것에 대한 이론에 반영되는 것만을 실재의 실재성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우리가 실재적 경험의 조건들을 규정한다면 모든 것은 달라진다. 이 실재적 경험의 조건들은 조건화되는 것보다 더 크지 않으며, 범주들과는 본성상의 차이를 지닌다. 여기서 감성론의 두 가지 의미는 서로 뒤섞여 하나가 된다. 감성적인 것의 존재가 예술작품을 통해 드러나는 동시에 예술작품은 경험이나 실험으로 나타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재현은 무엇 때문에 비난을 받는가? 동일성의 형식에 머물기 때문이며, 보이는 대상과 보는 주체라는 이중의 관계 아래 머물기 때문이다. 동일성은 각각의 부분적 재현 안에 보존된다기보다는 본연의 무한한 재현 전체 안에 보존된다. 무한한 재현은 관점들을 계속 중복하고 그것들을 계열들에 따라 유기적으로 조직한다. 그러나 이는 무위에 그친다. 이 계열들은 여전히 하나의 같은 대상, 하나의 같은 세계로 수렴된다는 조건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무한한 재현은 형태와 계기들을 계속 증식하고 그것들을 자기 운동 능력을 지닌 원환들을 통해 유기적으로 조직한다. 그러나 이는 무위에 그친다. 이 원환들은 여전히 하나의 단일한 중심만을 지니고, 이 유일한 중심은 의식이라는 거대한 원환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반면 현대 예술작품은 서로 교대하는 계열들과 원환적 구조들을 발전시키고 있다. 그때 예술은 철학에 재현을 폐기하는 데가지 이르는 길을 가리키고 있다. 원근법들을 복수화한다고 해서 원근법주의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각각의 원근법이나 관점에는 자족적 의미를 지닌 어떤 자율적 작품이 대응해야 한다. 즉 중요한 것은 계열들의 발산, 원환들의 탈중심화, '괴물'이다. 따라서 원환과 계열들 전체는 형상을 띠지 않는 어떤 카오스이다. 근거가 와해된 이 카오스는 그 자신의 고유한 반복, 자신의 재생산 외에는 다른 '법칙'을 갖지 않으며, 이 반복과 재생산은 발산하고 탈중심화하는 것의 전개 속에서 이루어진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이런 조건들은 말라르메의 [책]이나 조이스의 [피네건의 경야] 같은 작품들 안에서 이미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어 있다. 말하자면 이 작품들은 본성상 문제를 제기하는 작품들이다. 거기서는 읽히는 사물의 동일성은 비의적 단어들을 통해 한정되는 발산적 계열들 안에서 와해된다. 마찬가지로 읽는 주체의 동일성은 가능한 복수적인 다중의 독서 안에서, 중심을 이탈한 원환들 안에서 와해된다. 그러나 상실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각 계열은 다른 계열들의 회귀 안에서만 실존하기 때문이다. p.165-166
시간은 오로지 어떤 근원적 종합 안에서만 구성된다. 순간들의 반복을 대상으로 하는 이 종합은 독립적이면서 계속 이어지는 순간들을 서로의 안으로 수축한다. 이런 종합을 통해 체험적 현재, 살아 있는 현재가 구성된다. 그리고 시간은 이런 현재 안에서 펼쳐진다. 과거와 미래도 모두 이런 현재에 속한다. 즉 선행하는 순간들이 수축을 통해 유지되는 한에서 과거는 현재에 속한다. 기대는 그런 똑같은 수축 안에서 성립하는 예상이므로 미래는 현재에 속한다. 과거와 미래는 현재라고 가정된 순간과 구분되는 어떤 순간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순간들을 수축하는 현재 그 자체의 차원들을 지칭할 뿐이다. 현재는 과거에서 미래로 가기 위해 자기 자신으로부터 외출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살아 있는 현재는 과거에서 미래로 가지만, 그 과거와 미래는 현재 자체가 시간 안에서 구성한 과거이자 미래이다. 다시 말해서 살아 있는 현재는 특수한 것에서 일반적인 것으로 이행한다. 하지만 이때 그 현재는 수축을 통해 특수한 것들을 봉인하고 있다가 자신의 기대 범위 안에서 일반적인 것을 개봉한다. 이런 모든 점을 고려할 때, 이 종합은 수동적 종합이라 불러야 한다. 이 종합은 구성적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능동적인 것은 아니다. 이 종합은 정신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다만 모든 기억과 모든 반성에 앞서 응시하는 정신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시간은 주관적이다. 하지만 그것은 어떤 수동적 주체의 주관성이다. 수동적인 종합, 혹은 수축은 본질적으로 비대칭적이다. 현재 안에서 과거에서 미래로, 따라서 특수한 것에서 일반적인 것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며, 이를 통해 시간의 화살에 방향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p.171-172
기억은 자신에게 고유한 '시간의 공간' 안에 특수한 경우들을 보존하고, 그런 가운데 이 경우들을 구별되는 경우들로 재구성한다. 그래서 과거는 더 이상 파지에 의한 직접적 과거가 아니다. 다만 재현에 의한 반성적 과거, 반성되고 재생된 특수성일 뿐이다. 이에 상응하여 미래도 역시 예지에 의한 직접적 미래로 남아 있을 수 없다. 다만 예견에 의한 반성적 미래, 지성에 의해 반성된 일반성이 되는 것이다.(지성을 통해 상상력의 기대는, 관찰되고 상기된 유사하면서도 구별되는 경우들의 수와 비례적 관계에 놓인다.) 이는 기억과 지성의 능동적 종합이 상상력의 수동적 종합과 중첩되고, 또 그 능동적 종합이 수동적 종합에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반복의 구성에는 이미 세 가지 층위가 함축되어 있다. 먼저 즉자의 층위가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는 반복은 사유 불가능하게 된다. 혹은 생성되고 있는 반복은 이 층위를 통해서는 단지 와해될 뿐이다. 그 다음 수동적 종합에 따르는 대자의 층위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층위에 기초한 반성적 재현의 층위가 있다. 이는 '우리에 대하여'라는 형식의 반성적 재현이며, 이 재현은 능동적 종합 안에서 성립한다. 연상주의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미묘한 성격을 띠고 있다. 그와 비슷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베르그손이 흄의 분석들을 다시 찾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가령 시계가 네 시를 알린다고 하자. .....각각의 타종, 각각의 진동이나 자극은 순간적 정신인 다른 타종이나 진동에 대해 논리적으로 독립적인 관계에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들을 어떤 내적이고 질적인 인상 안으로 수축한다. 이 수축은 모든 회상이나 분명한 계산의 바깥에서 성립한다. 그 수축은 살아 있는 현재 안에서, 지속으로서의 이 수동적 종합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 후에 우리는 그 타종들을 어떤 보조적인 공간과 파생적인 시간 안에 다시 위치시킨다. 여기서 우리는 그것들을 재생할 수 있고 반성할 수 있으며 얼마든지 양화 가능한 외부적 인상들인 것처럼 계산할 수 있다. p.172-173
경우들의 반복이 열려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이항 대립을 통해 요소들 사이에 폐쇄적 관계가 성립한 이후에만 그러하다. 거꾸로 요소들의 반복이 닫혀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그 배후에 경우의 구조들이 자리하고 있을 때만 그러하다. 이 구조들 안에서 요소들의 반복 -총괄적 관점에서 바라본 반복- 은 대립하고 있는 두 요소들 중 한쪽의 역할을 스스로 떠맡는다. 즉 4는 단지 네 번의 타종과 맺는 관계 안에서만 일반성을 띠는 것이 아니다. '네 시'는 지나갔거나 뒤따라올 30분과 더불어, 심지어 지각 세계의 지평에서는 아침과 저녁의 뒤바뀐 네 시들과 더불어 갈등 관계에 놓인다. 수동적 종합 안에서 반복의 두 형식은 언제나 서로 의존하는 관계에 있다. 즉 경우들의 반복은 요소들의 반복을 가정하지만, 요소들의 반복은 필연적으로 스스로 자신을 넘어서서 경우들의 반복 안으로 들어선다.(틱-틱 일반을 어떤 하나의 틱-탁으로 경험하는 수동적 종합의 본성적인 경향은 이로부터 비롯된다.) p.174-175
모든 유기체는 수축, 파지, 기대들이 어우러진 어떤 총합이다. 수용적이고 지각적인 요소들 안에서, 그리고 또한 내장들 안에서 볼 때 유기체는 수축, 파지, 기대 안에 놓여 있다. 생명이 숨쉬는 이 원초적 감성의 수준에 주목해보라. 여기서는 체험된 현재가 이미 시간 안에서 어떤 과거와 미래를 구성하고 있다. 이 미래는 욕구 안에서 나타나며, 이 욕구는 기대의 유기체적 형식에 해당한다. 반면 파지의 과거는 세포의 유전에서 나타난다. 게다가 이런 유기체적 종합들은 자신을 발판으로 하는 지각적 종합들과 조합되며, 그런 가운데 스스로 심리-유기체적 기억과 지성의 능동적 종합 안에서 다시 자신을 펼쳐간다(본능과 학습). 따라서 수동적 종합과 관련하여 우리는 단지 반복의 형식들을 구별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아야 한다. 수동적 종합들의 수준들, 이 수준들 사이의 조합들, 그리고 이 수준들과 능동적 종합들의 조합들을 구별하는 데까지 나아가야만 한다. 기호들의 영역은 이 모든 것에 의해 형성된다. p.176
습관은 반복에서 새로운 어떤 것, 곧 차이(일단 일반성으로 설정된 차이)를 훔쳐낸다. 습관의 본질은 수축에 있다. 이를 증명해주는 것은 언어이다. 가령 습관을 '수축한다[붙인다]'는 말이 있는데, 이 동사는 오직 어떤 하비투스를 구성할 수 있는 보어가 있을 때만 사용된다. 물론 심장이 팽창할 때보다 수축할 때 더 많은 습관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또는 그보다 더한 습관은 아니라는) 반박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완전히 다른 두 종류의 수축을 혼동하기 때문이다. 즉 수축은 틱-탁.....유형의 계열 안에서 능동적인 두 요소 중의 하나를, 그 계열 안에서 대립하고 잇는 두 시간 중의 하나를 지칭할 수 있다. 이때 다른 요소는 이완이나 팽창이 된다. 그러나 수축은 또한 응시하는 영혼 안에서 계속 이어지는 틱-탁들의 융합을 가리킨다. 이것이 수동적 종합이다. 이 수동적 종합은 우리의 삶의 습관을 구성한다. 이 수동적 종합은 우리의 삶의 습관을 구성한다. 다시 말해서 그것이 구성하는 것은 '이것'이 계속되리라는 우리의 기대이며, 두 요소 중 하나가 다른 요소 이후에 뒤다라올 것이라는 우리의 기대이다. 이때 우리의 경우가 영속하리라는 확신이 생긴다. 그러므로 습관이 수축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반복의 한 요소를 형성하기 위해 다른 순간적 행위와 합쳐지는 순간적 행위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응시하는 정신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반복의 융합이다. 심장, 근육, 신경, 세포 등에는 어떤 영혼이 있다고 해야 한다. 하지만 이 영혼은 응시하는 영혼이며, 이 영혼의 모든 역할은 습관을 수축하는[붙이는] 데 있다. 이는 결코 미개하거나 신비스러운 가설이 아니다. 오히려 거꾸로 습관은 여기서 자신의 충만한 일반성을 드러낸다. 이 일반성은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가지는 감각-운동의 습관들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존재인 원초적 습관들에 관련되어 있고, 우리를 유기적으로 형성하는 수천의 수동적 종합들에 관련되어 있다. 우리가 습관들로 이루어져 있다면, 우리를 유기적으로 형성하는 수천의 수동적 종합들에 관련되어 있다. 우리가 습관들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는 우리가 수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수축하게 되는 것은 응시를 통해서이다. 이 둘은 동시적 사태이다. 우리는 어떤 응시들이고, 우리는 어떤 상상들이다. 우리는 어떤 일반성들이고, 우리는 어떤 경쟁적 지망들이며, 우리는 어떤 만족들이다. 왜냐하면 지망의 현상은 수축하는 응시 이외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수축하는 응시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수축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리의 권리와 기대를 천명한다. 그리고 우리가 응시하는 한에서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의 만족을 천명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응시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오로지 응시하기 때문에 비로소 실존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수축하기 때문에 비로소 존재한다. 우리는 우리가 있기 위해 먼저 있는 것을 응시하고 수축하며, 그런 가운데 실존한다. 쾌락은 그 자체로 수축이나 긴장인가, 아니면 언제나 이완의 과정과 이어져 있는가? 하지만 이것은 잘못 제기된 물음이다. 쾌락의 요소들은 자극체들이 이완과 수축들을 힘차게 이어나갈 때 발견될 것이다. 하지만 쾌락은 왜 우리의 심리적인 삶 안에 잇는 하나의 요소나 경우일 뿐 아니라 모든 경우 안에서 우리의 심리적인 삶을 지배하는 어떤 최고의 원리인가? 이는 앞의 것과 전적으로 다른 종류의 물음이다. 쾌락이 원리라면, 이는 그것이 어떤 충만한 응시의 흥분이기 때문이다. 응시는 이완과 수축으로 이루어진 경우들을 자기 자신 안에서 수축할 때 충만해진다. 거기에는 수동적 종합의 지극한 행복이 있다. 응시를 통해 우리는 쾌락을 맛본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사물을 응시함에도 불구하고, 그 응시가 가져다 준 쾌락(자기만족)을 통해 모두 나르키소스가 된다. 우리는 응시에서 끌어내는 쾌락 때문에 나르키소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응시하는 것을 통해 언제나 악타이온이 된다. 응시한다는 것, 그것은 훔쳐낸다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이미지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언제나 먼저 다른 것을, 물, 아르테미스, 나무들을 응시해야만 한다.
습관의 연속성 이외의 다른 연속성이 없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보여준 사람은 새뮤얼 버틀러이다. 그에 따르면 우리는 수많은 습관들의 연속성 말고는 다른 연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수많은 습관들은 우리 안에서 그토록 많은 미신과 응시의 자아들을, 그토록 많은 경쟁적 지망자와 만족들을 구성하고 형성한다. "사실 들판의 밀 자신은 자신의 실존에 관한 한 미신적인 지반에 뿌리내리고 성장한다. 그것이 흙과 습기를 밀알로 변형시키는 것은 오로지 주제넘은 믿음 덕분이다. 밀은 그런 변형을 이루어낼 자신의 고유한 능력을 한없이 신뢰하고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신뢰나 믿음이 없다면 밀은 무력해질 것이다." 경험주의자가 아니라면 이런 행복한 표현을 감히 엄두조차 내지 못할 것이다. 핡과 습기의 수축이 있고, 이것이 밀알이라 불린다. 그리고 이 수축은 어떤 응시이며 이 응시가 가져오는 자기만족이다. 들판의 백합은 단지 자신의 실존을 통해 이미 어떤 영광을 노래하고 있다. 하늘, 여신과 신들의 영광을, 다시 말해서 자신이 수축하면서 응시하는 요소들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이다. 어떤 유기체가 예외이겠는가? 모든 유기체는 반복의 요소와 경우들로 이루어져 있다. 응시되고 수축된 물, 질소, 탄소, 염소, 황산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래서 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습관들을 서로 얽고 조여 매고 있다. 유기체들은 [엔네아데스] 3권의 "모든 것은 응시이다!"라는 숭고한 말과 더불어 잠에서 깨어나고 있다. 물론 모든 것이 응시라고 말하는 것, 심지어 바위와 나무들, 동물과 인간들, 나아가 악타이온과 사슴, 나르키소스와 꽃, 심지어 우리의 행위와 욕구들조차 응시라고 말하는 것은 '반어'인지 모른다. 그러나 반어 또한 여전히 어떤 응시이다 그것은 응시 이외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다. ..... 플로티누스에 따르면, 사람들은 오로지 자신의 고유한 이미지를 응시하기 위해서 자신의 유래를 향하여 스스로 뒤돌아설 때만 그 이미지를 규정하고 향유할 수 있다. p.177-180
행위하는 자아 아래에는 응시하는 작은 자아들이 있다. 행위와 능동적 주체를 사능하게 하는 것은 이 작은 자아들이다. 우리가 '자아'를 말할 수 있다면, 이는 오로지 우리 안에서 응시하는 이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자아를 말하는 것은 항상 어떤 제삼자이다. 심지어 미로의 쥐 안에도, 쥐를 이루는 각각의 근육 안에도 이 응시하는 영혼들이 있다고 해야 한다. 그런데 응시는 어떠한 행위의 순간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응시는 항상 뒤로 물러서 있다. 응시는 그 어떤 것도 '행하지' 않는다.(비록 어떤 것이, 완전히 새로운 어떤 것이 응시 안에서 행해짐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응시를 망각하기 쉬우며, 반복을 전혀 끌어들이지 않고 자극과 반응의 전 과정을 해석하기 쉽다. 왜냐하면 반복을 끌어들이는 것은 단지 자극 및 반응들과 응시하는 영혼들의 관계 안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p.181
즉자의 상태에서 끊임없이 와해되는 반복과 재현의 공간 안에서 우리에 대해 펼쳐지고 보존되는 반복 사이, 그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그 차이는 반복의 대자적 측면이고, 이 측면은 상상적인 것이다. 차이는 반복에 거주한다. 수평적 구도에서 볼 때 차이는 우리로 하여금 반복 안의 한 질서로부터 다른 질서로 옮겨가게 해준다. 이때 우리는 즉자적으로 와해되는 순간적인 반복에서 출발하여 수동적인 종합을 경유하고, 이를 통해 능동적으로 재현된 반복으로 이행한다. 다른 한편 수직적 구도에서 볼 때 차이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반복의 질서로부터 다른 반복의 질서로 옮겨가게 해준다. 이때 우리는 수동적인 종합들 그 자체 안에서 하나의 일반성으로부터 다른 일반성으로 이행한다. p.182
차이는 두 반복 사이에 있다. 이는 역으로 반복이 또한 두 차이 사이에 있으며, 우리로 하여금 차이의 한 질서로부터 다른 한 질서로 이동하게 만든다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가브리엘 타르드가 지적했던 것처럼, 변증법적 전개는 반복이다. 이 반복은 어떤 일반적 차이들의 상태로부터 독특한 차이로 옮겨가는 이행이며, 외부적 차이들로부터 내부적 차이로 향하는 이행이다. 요컨대 반복은 차이의 분화소이다. p.183 *주 6 - 타르드가 뒤르켐을 비난한 것은 그가 설명해야만 하는 것, 즉 "수백만 사람들의 유사성"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기 때문이다. "비인격적 소여들 아니면 위대한 인간들의 이념들"이라는 양자택일의 자리에, 그는 자잘한 사람들의 변변찮은 관념들, 변변찮은 발명들, 그리고 모방적 흐름들 사이의 상호 간섭들을 놓는다. 타르드가 창시한 것, 그것은 미시 사회학이다. 이 미시 사회학은 반드시 두 개인들 사이에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이미 단일하고 똑같은 개인 안에 토대를 두고 있다.(예를 들면 주저한다는 것은 "극소화된 사회적 대립"이다. 또는 발명은 "극소화된 사회적 적응"이다.) 개인 연구물들에서 출발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반복이 어떻게 작은 변이들을 모으고 통합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 언제나 "차이짓는 차이소"를 이끌어내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 타르드의 철학 전체는 그래서 차이와 반복의 변증법으로 요약된다. 그것은 어떤 우주론 전체 위에 미시사회학의 가능성을 근거짓는 변증법이다.
즉 응시 안의 수축은 요소나 경우들을 따르는 반복의 질서에 언제나 질적 변용을 가져온다. 수축은 필연적으로 특정한 지속을 띤 현재를 형성한다. 이 현재는 종, 개체, 유기체, 고려되는 유기체의 부분들에 따라 수명을 다하고 이행하는 현재, 변모하는 현재이다. 계속 이어지는 두 현재는 수축된 순간들의 수가 더 광범위한 세 번재의 현재와 동시간적일 수 있다. 유기체는 하나의 현재적 지속을 향유하거나 상이한 현재적 지속들을 향유한다. 이는 자신의 응시적 영혼들이 발휘하는 수축의 자연적 범위에 따라 결정된다. 이는 피곤이 실질적으로 응시에 속한다는 것을 뜻한다. 아무것도 행하는 자는 피곤한 사람이라는 그럴듯한 말이 있다. 피곤은 영혼이 자신을 응시하는 것을 더 이상 수축할 수 없는 국면을 표시한다. 그것은 응시와 수축이 와해되는 지점이다. 우리는 응시만큼이나 많은 피곤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욕구와 같은 현상은, 행위와 욕구가 결정하는 능동적 종합들의 관점에서는 일종의 '결여'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욕구는 그것을 조건짓는 수동적 종합의 관점에서는 극단적인 '포만'이나'피곤'으로 바다아들여질 수 있다. 욕구는 정확히 가변적인 현재의 한계들을 표시한다. 현재는 욕구가 분출하는 두 지점 사이에서 범위를 얻고, 응시가 지속되는 시간과 하나가 된다. 욕구의 반복과 이것에 의존하는 모든 것의 반복은 시간의 종합에 고유한 시간을 표현하며, 이 종합의 시간 내적 특성을 표현한다. 반복은 본질적으로 욕구 안에 기입되어 있다. 왜냐하면 욕구는 본질적으로 반복과 관계하는 심급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 심급은 반복의 대자적 측면, 곧 특정한 지속의 대자적 측면을 형성하고 있다. 우리의 리듬들, 우리의 저장된 양분들, 우리의 반응 시간들, 우리를 구성하는 수천의 매듭과 현재들 그리고 피곤들은 모두 우리의 응시들로부터 정의된다. p.184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욕구를 능동적 종합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해하려는 우리의 성급한 태도 때문이다. 하지만 이 능동적 종합들은 사실 오로지 응시의 토양 위에서 성립하고 있을 뿐이다. 게다가 만일 우리가 능동적 종합들을 그것들이 가정하는 이 바탕 위에 다시 위치시킨다면, 능동성은 차라리 물음들과 함께 문제제기의 장들이 구성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p.186
이 살아있는 현재는, 그리고 이와 더불어 모든 유기체적이고 심리적인 삶은 습관에 의존한다. 콩디야크를 따라 우리는 습관을 다른 모든 심리적 현상들이 파생되는 정초 지점으로 간주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다른 모든 현상들이 응시들에 의존하거나 그 자체로 어떤 응시들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욕구, 물음, '반어'조차 그 자체가 응시인 것이다. p.187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여기서 존재가 형성되거나 수동적 자아가 있는 것은 바로 어떤 소유를 통해서이다. 모든 수축은 어떤 주제넘은 자만, 경쟁적 지망이다. 다시 말해서 수축은 자신이 수축하는 것에 대한 기대나 권리를 표명하고 자신의 대상이 자신을 벗어나자 마
현재는 현재인 '동시에' 과거가 아니고서는 결코 지나갈 수 없을 것이다. 과거는 먼저 한때 현재였던 '동시에' [과거로서] 미리 구성되어 있지 않다면 결코 구성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역설이다. 이는 과거와 그것이 한때 구가했던 현재의 동시간성이라는 역설이다. 우리는 이 역설에서 지나가는 현재를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유를 찾을 수 있다. 현재가 언제나 지나가고 또 새로운 현재를 위해 지나가는 것은 과거가 현재로서으이 자기 자신과 동시간적이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두 번째 역설, 곧 공존의 역설이 뒤따른다. 만일 각각의 과거가 자신이 한때 구가했던 현재와 동시간적이라면, 사실 모든 과거는 그것이 과거이기 위해 지금 거리를 둔 새로운 현재와 공존하는 셈이다. 과거는 첫 번째 현재[사라진 현재] '이후'에 있지 않은 것처럼 더 이상 두 번째 현재[현행적 현재] '안'에도 있지 않다. 따라서 베르그손은 각각의 현행적 현재는 단지 지극한 수축 상태의 과거 전체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과거는 또 다른 현재가 생겨나도록 만들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의 현재를 지나가게 할 수 없다. 하지만 과거 자체는 지나가지도 생겨나지도 않는다. 바로 그렇기 대문에 과거는 시간의 한 차원에 머물기는 커녕 시간 전체의 종합이며, 현재와 미래는 단지 그 종합에 속하는 차원들에 불과하다. 따라서 "과거가 있었다."라는 말은 성립할 수 없다. 과거는 더 이상 실존하지 않는다. 과거는 실존하는 것이 아니라 끈덕지게 자신을 주장하면서 내속하고 공속하며, 그런 의미에서 있다. p.193-194
각각의 현재는 전체의 한 수준을 수축하지만, 이 수준은 이미 이완이나 수축의 상태에 있다. 다시 말해서 현재의 기호는 극한으로의 이행이며, 어떤 수준이든 하나의 수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최대한의 수축이다. 하지만 그렇게 선택된 수준은 그 자체로 수축되어 있거나 팽창되어 있으며, 무한히 많은 다른 가능한 수준들 가운데 하나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의 삶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은 복수의 삶에 대해서도 타당하다. 각각의 삶이 어떤 지나가는 현재라면, 하나의 삶은 다른 삶을 다른 수준에서 다시 취할 수 있다. 이는 마치 철학자와 돼지, 범죄자와 성인이 거대한 원뿔의 서로 다른 수준에서 똑같은 과거를 연출하는 것과 같다. 이것이 바로 윤회라 불리는 것이다. 각각의 인물은 자신이 낼 소리의 높이나 색깔, 아마 가사까지 선택할 것이다. 하지만 어떤 가사가 붙든지 곡조는 늘 같고, 음고와 음색이 아무리 달라져도 후렴은 늘 같아진다. p.198-199
과거 전체는 즉자적으로 자기 자신 안에 보존된다. 하지만 어떻게 그 과거를 우리에 대해 되살려낼 것인가? 과거의 즉자 존재를 과거가 한때 구가했던 현재나 과거가 과거이기 위해 거리를 둔 현행적 현재로 환원하지 않고 어떻게 그 존재 안으로 침투해 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그 존재를 우리에 대해 되살려낼 것인가? 바로 이 부근에서 프루스트는 베르그손의 뒤를 이어 다시 묻고 있다. 그런데 대답은 아주 오래 전부터 주어져 있는 것 같다. 상기가 바로 그것이다. 사실 상기는 자발적 기억의 모든 능동적 종합과는 본성상 다른 어떤 수동적 종합이나 비-자발적 기억을 지칭한다. 콩브레는 과거에 현전했던 모습 그대로, 혹은 앞으로 현전할 모습 그대로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결코 체험된 적이 없었던 어떤 광채 안에서, 결국 이중의 환원 불가능성을 드러내는 어떤 순수 과거로 다시 나타날 뿐이다. 이 순수 과거는 자신이 언젠가 구가했던 현재로도, 언젠가 구가할 수도 있을 현행적 현재로도 환원되지 않으며, 이런 이중의 환원 불가능성은 그 두 현재의 상호 충돌에 힘입고 있다. 망각이 경험적으로 극복되는 한에서 사라진 현재들은 망각 저편의 능동적 종합 안에서 재현된다. 하지만 콩브레가 결코 현전했던 적이 없는 어떤 과거의 형태로 출현하는 것, 곧 콩브레의 즉자 존재가 출현하는 것은 바로 본연의 망각 안에서이다. 만일 과거의 즉자 존재가 있다면, 상기는 그것의 본체이거나 그 본체에 사로잡힌 사유이다.p.200-201
시간의 텅 빈 형식 혹은 시간의 세 번째 종합.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가? 북부의 왕자에 따르면, "시간의 축은 빗장이 풀려 있다." 과연 북부의 철학자는 똑같은 사태를 말하고, 오이디푸스적이므로 햄릿답다고 할 수 있을까? 빗장, 경첩, 축. 바로 이 축의 뒷받침이 있기에 시간은 정확히 방위 기준점들 -시간에 의해 측정되는 주기적 운동들이 지나가는 점들- 에 종속된다.(시간은 세계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영혼에 대해서도 운동의 수이다.) 반면 빗장이 풀린 시간은 미친 시간을 의미한다. 그것은 신이 부여했던 만곡에서 벗어난 시간, 지나치게 단순한 원환적 형태로부터 풀려난 시간, 자신의 내용을 이루던 사건들에서 해방된 시간, 운동과 맺었던 관계를 전복하는 시간, 요컨대 자신이 텅 빈 순수한 형식임을 발견하는 시간이다. 이때는 결코 어떤 것도 시간 안에서 (원환이라는 지나치게 단순한 모양을 따라) 펼쳐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 대신 시간 자체가 스스로 자신을 펼쳐간다.(다시 말해서 외관상 어떤 원환이기를 그친다.) 시간은 기수적이기를 그치고, 서수적이 된다. 바로 이것이 시간의 순수한 순서이다.
사실 언제나 행위가 '자아에게는 너무 벅찬' 이미지로 다가오는 어떤 시간이 있다. 과거나 이전은 바로 여기서 선험적으로 정의된다. 즉 사건 자체가 완료되었는지의 여부, 행위가 이미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과거, 현재, 미래는 이런 경험적 기준에 따라 분배되는 것이 아니다. 오이디푸스는 이미 행위했고, 햄릿은 아직 행위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그들은 과거에 속하는 상징의 첫 번째 부분을 살아내고 있다. 행위의 이미지를 자신에게는 너무 벅찬 것으로 체험하면서 그들은 과거 안에서 자기 자신을 살아내고 또 과거 안으로 내던져진다. 따라서 각운의 중단 자체를 전제하는 두 번째 시간은 변신의 현재, 행위에 필적하게 된느 동등하게-되기, 자아의 이분화이다. 그것은 행위의 이미지 안에 어떤 이상적 자아를 투사하는 시간이다.(그것은 햄릿의 바다 여행이나 오이디푸스의 탐문 결과에 의해 드러난다. 즉 주인공은 행위를 '감당할 수 있게' 된다.) 미래를 발견하는 세 번째 시간의 경우 -이 시간은 사건, 행위가 자아의 일관성을 배제하는 어떤 비밀스러운 일관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일관성은 사건과 행위에 필적할 수 있게 된 자아에 등을 돌리고, 자아를 수천 조각으로 쪼개어 투사한다. 말하자면 새로운 세계를 잉태한 자는 자신이 낳고 있는 파열하는 다양체에 의해 압도되고 탕진되어버린다. 즉 자아가 필적하게 된 것, 그것은 즉자적 비동등이다. 시간의 순서에 따라 균열된 나와 시간의 계열에 따라 분할된 자아는 바로 이런 방식을 통해 서로 상응하고 어떤 공통의 출구에 이른다. 그 출구는 이름도, 가족도, 특질도, 자아나 나도 없는 인간, 어떤 비밀을 간직한 "평민"에 있다. 그는 이미 초인, 그 흩어진 사지가 숭고한 이미지의 주위를 맴돌고 있는 초인이다. p.211-212
반복은 반성의 개념이기 이전에 행위의 조건이다. 우리는 한번은 과거를 구성하는 이 양태에 따라 반복하고 그 다음 번에는 변신의 현재 안에서 반복한다는 조건에서만 어떤 새로운 것을 생산할 수 있다. 그리고 생산되는 것, 절대적으로 새로운 것 자체도 역시 반복 이외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세 번째 반복, 이제는 과잉에 의한 반복, 영원회귀에 해당하는 미래의 반복이다. 물론 우리는 영원회귀를 마치 시간의 모든 계열이나 집합에 영향을 미치고 미래뿐 아니라 과거와 현재에도 적용되는 것처럼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해석은 그저 서론에 불과하다. p.213
영원회귀는 평민, 이름 없는 인간만을 되돌아오게 한다. 영원회귀는 죽은 신과 분열된 자아를 자신의 원환 안으로 끌어들인다. 영원회귀는 태양을 돌아오게 하지 않는다. 태양의 폭발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영원회귀는 단지 성운들에만 관계될 뿐이다. 영원회귀는 성운들과 뒤섞여 하나가 되고 오로지 성운들을 위해서만 운동한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회귀를 마치 시간의 집합 전체에 적용되는 것인 양 해석한다면, 이는 언젠인가 차라투스트라가 정령에게 말했던 것처럼 사태를 단순화하는 것이다. 이는 또 언제인가 차라투스트라가 정령에게 말했던 것처럼 사태를 단순화하는 것이다. 이는 또 언제인가 차라투스트라가 동물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사태를 진부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는 너무 단순한 원환, 그러니까 지나가는 현재를 내용으로 하고 상기의 과거를 형태로 하는 단순한 원환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그러나 바로 정확히 시간의 순서, 순수하고 텅 빈 형식으로서의 시간을 통해 그런 원환은 와해되어버렸다. 그런데 그런 와해는 훨씬 덜 단순하고 훨씬 더 비밀스러우며 훨씬 더 찌그러져 있는 어떤 원환을 위해서, 훨씬 더 성운에 가깝고 영원히 궤도를 벗어나는 원환을 위해서 일어난다. 이 새로운 원환은 오로지 계열상의 세 번째 시간 안에서만 재형성되는 차이의 원환, 탈중심화된 원환이다. 시간의 순서가 같음의 원환을 깨뜨리고 시간을 계열화했다면, 이는 오로지 그 계열의 끝에서 어떤 다름의 원환을 재형성하기 위해서였다. 시간의 순서 안에 '결정적인 어떤 한 순간'이 있다면, 이는 오로지 그 비의적 의미의 마지막 원환에서 성립하는 '매 순간'을 위해서이다. 시간의 형식은 오로지 영원회귀 안의 비형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있다. 극단적 형식성은 오로지 과도한 비형식을 위해서 있다. 근거가 어떤 무-바탕을 향해, 보편적 근거와해 -그 자체로 회전하는 가운데 오로지 도래 중인 것만을 되돌아오게 하는 근거와해- 를 향해 극복되는 것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이다. p.214-215
영원회귀의 관점에서 본 비극, 희극, 역사, 신앙
이 시간의 마지막 종합 안에서 볼 때, 현재와 과거는 이제 미래에 속하는 차원들에 불과하다. 즉 과거는 조건으로서, 그리고 현재는 행위자로서 미래에 속한다. 첫 번째 종합, 습관의 종합은 시간을 어떤 살아있는 현재로 구성했고, 이런 구성은 과거와 미래가 의존하는 어떤 수동적 정초 안에서 이루어졌다. 두 번째 종합, 기억의 종합은 시간을 어떤 순수 과거로 구성했고, 이런 구성은 현재를 지나가게 하고 또 다른 현재가 도래하게 하는 어떤 근거의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세 번째 종합에서 현재는 제거될 운명에 처한 배우, 저자, 행위자에 불과하다. 과거는 결핍에 의해 작용하는 어떤 조건에 불과하다. 시간의 종합은 세 번째 단계에 이르러 어떤 미래를 구성하고, 이 미래는 조건에 대한 생산물의 무제약적 특성을 저자나 배우에 대한 작품의 독립성을 동시에 천명한다. 현재, 과거, 미래는 세 가지 종합을 거쳐서 일어나는 본연의 반복으로 드러나지만, 이는 서로 매우 다른 양태들을 통해서이다. 현재는 반복을 일으키는 어떤 것에 해당한다. 과거는 반복 자체에 해당한다. 그리고 미래는 반복되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반복의 비밀은 반복되는 것 안에 있다. 반복되는 것은 두 번에 걸쳐 전조되고 지시되는 셈이다. 최상의 반복은 바로 미래의 반복이다. 이 미래의 반복을 통해 다른 두 반복은 종속적 지위에 놓이고 따라서 자율성을 상실한다. 사실 첫 번째 종합은 단지 시간의 내용과 정초에만 관련된다. 두 번째 종합은 단지 시간의 근거에만 관련된다. 하지만 그 너머의 세 번째 종합은 시간의 순서, 집합, 계열, 그리고 최종 목표를 마련해준다. 반복의 철학은 반복 자체를 반복할 수 밖에 없도록 운명지어져 있고, 그런 한에서 이 모든 '단계들'을 통과해간다. 그러나 이 단계들을 거치면서 반복의 철학은 확실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이 프로그램의 항목들로는 이런 것들을 꼽을 수 있다. 반복을 미래의 범주로 만들기 -습관의 반복과 기억의 반복을 이용하되 단계들로만 이용하기, 그 단계들을 길 위에 남기고 떠나기- 한 손으로 하비투스에 대항하여 싸우고 다른 한 손으로 므네모시네에 대항하여 싸우기- 더나 덜한 차이를 '훔쳐내는' 데 그치는 반복의 내용(하비투스)을 거부하기 -차이를 포괄하되 여전히 같음과 닮음에 종속시킬 뿐인 반복의 형식(므네모시네)을 거부하기- 지나치게 단순한 순환 주기들, 곧 순수 과거가 조직하는 순환 주기(아득한 태고의 순환 주기)뿐 아니라 습관적 현재가 겪는 순환 주기(관습적 순환 주기)를 거부하기 -기억의 근거를 결핍에 의한 단순 조건으로 바꾸어놓기, 뿐만 아니라 습관의 정초를 '소유'의 파산으로, 행위자의 변신으로 바꾸어놓기 -작품이나 생산물의 이름으로 행위자의 조건을 몰아내기- 반복을 어떤 차이를 '훔쳐낼' 대상으로 삼거나 가변적 차이를 포괄하는 것으로 만드는 대신, '절대적으로 차이나는 것'의 사유와 생산으로 만들기- 반복의 대자 존재가 차이의 즉자 존재가 되도록 하기. p.217-218
영원회귀는 어떤 신앙이 아니라 신앙의 진리이다. 즉 영원회귀는 분신이나 허상을 고립시켰다. 영원회귀는 희극성을 해방하여 초인의 요소로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클로소브스키가 말하는 것처럼 영원회귀는 어떤 교의라기보다 모든 교의의 허상(지고한 반어)이며, 어떤 믿음이라기보다 모든 믿음의 패러디(지고한 해학)이다. 즉 영원회귀는 영원히 미래로부터 도래하고 있는 믿음이자 교의이다. 무신론자는 믿음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는 권유가 있다. 믿음이 일깨운다고 간주되는 신앙의 관점에서, 요컨대 은총의 관점에서 무신론자를 심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권유는 너무 강력해서 오히려 우리는 그 반대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무신론자의 관점에서 신앙인을 심판하고 싶어지는 것이다. 이미 신앙인 안에 살고 있는 난폭한 무신론자, 은총 안에 영원히 주어져 있고 '매 순간' 주어져 있는 반-그리스도라면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p.221
하지만 묶인 흥분을 현실원칙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용하면서 새로운 사태에 도달하게 된다. 게다가 능동적 종합이 수동적 종합 위에 구축되려면, 이를 위해서는 수동적 종합이 반드시 그 능동적 종합과 동시적으로 존속해야 하고, 자기 자신을 가와 동시에 전개해가야 하며, 또 능동성에 대해 비대칭적이면서도 보충적인 관계에 있는 새로운 정식을 발견해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 p.228
하나의 계열은 다른 계열 없이는 현존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두 계열은 서로 닮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걸음마에 대한 앙리 말디네의 사례 분석은 그럴듯하게 들린다. 그 분석에 따르면, 유아적 세계는 결코 원환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이지 않다. 오히려 타원적이고 이중의 중심을 갖는데, 이 두 중심은 모두 대상적이거나 객체적이지만 본성상 서로 다르다. 게다가 어쩌면 그 두 중심은 서로 유사하지 ㅇ낳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는 어떤 교차, 어떤 뒤틀림, 어떤 나선, 어떤 8자형이 형성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드와 위상학적으로 구별되는 자아는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 것일까? 자아는 8자형의 교차 지점에, 서로를 잘라내는 비대칭적인 두 원환의 접합 지대에, 다시 말해서 현실적 대상들의 원환과 잠재적 대상이나 초점들의 원환이 만드는 접합 지대에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p.229-230
하지만 앞에서 순수 과거는 자신의 고유한 현재와 동시간적인 것으로 정의되었다. 그렇게 정의된 순수 과거는 자신의 고유한 현재와 동시간적인 것으로 정의되었다. 그렇게 정의된 순수 과거는 지나가는 현재에 선재하고 또 모든 현재가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잠재적 대상에 질이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바로 이런 순수 과거이다. 잠재적 대상은 순수 과거의 한 조각이다. p.233
잠재적 대상은 언제나 자기 자신의 반쪽이고, 나머지 반쪽을 차이나고 부재하는 것으로 정립한다. 그런데 앞으로 보게 될 것이지만, 이 부재는 부정적인 것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즉 자기 자신의 영원한 반쪽인 잠재적 대상은 자신이 있어야 하는 곳에 있지 않고, 오로지 그런 조건에서만 자신이 있는 곳에 있다. 잠재적 대상은 자신이 없는 곳에서 탐색되어야 하고, 오로지 그런 조건에서만 자신이 발견되는 곳에 있다. 잠재적 대상은 자신을 지니고 있는 자들에게 소유되지 않지만 동시에 자신을 지니지 않는 자들에게 소유된다. 그것은 언제나 어떤 반과거 시제의 존재자이다. 이런 의미에서 에드거 포의 도둑맞은 편지를 잠재적 대상과 같은 것으로 보는 라캉의 글들은 우리에게 좋은 모범으로 비친다. p.234
반복은 오로지 위장들과 더불어, 그리고 그 위장들 안에서만 구성되고 이 위장들은 현실적 계열들의 항과 관계들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지만 이는 반복이 잠재적 대상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때 잠재적 대상은 무엇보다 전치를 고유한 속성으로 하는 어떤 내재적 심급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장이 억압을 통해 설명된다고는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사정은 오히려 반대이다. 억압은 현재들의 표상과 관련되는 어떤 하나의 귀결로서 산출된 것이다. 그것은 반복이 자신의 규정 원리를 특징짓는 전치에 힘입어 필연적으로 위장되기 때문에 비로소 산출되는 귀결이다. p.240-241
부모는 주체의 궁극적인 항이 아니라 상호 주관성의 중간항에 해당하는 인물들이다. 그들은 서로 다른 주체들에 대해 한 계열에서 다른 계열로 이어지는 의사소통과 변장의 형식들이고, 이 형식들은 잠재적 대상의 이동을 통해 규정된다. 그러므로 가면들의 뒤에는 여전히 가면들이 있다. 맨 뒤에 감춰져 있는 것도 여전히 어떤 은신처이며, 이런 과정은 무한히 계속된다. 여기에 무슨 착각이 있다면, 어떤 사물이나 인물의 가면을 벗긴다는 착각말고는 없다. 반복의 상징적 기관인 팔루스 자체는 감춰져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또한 어떤 가면이다. 이는 가면이 두 가지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좀 줘, 제발 부탁이야, 나에게 줘. ......그런데 무엇을? 다른 가면 말이야." 가면은 우선 위장을 의미하고, 이 위장은 권리상 공존하는 두 현실적 계열의 항과 관계들에 상상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그보다 심층적인 차원에서 가면은 전치를 의미하고, 이 자리바꿈은 상징적인 잠재적 대상에 본질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때 이 잠재적 대상은 자신의 계열뿐 아니라 현실적 계열들 안에서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다. p.242-243
확실히 무의식은 욕망하고 또 욕망밖에 할 줄 모른다. 그러나 잠재적 대상을 통해 욕망과 욕구 사이의 원리적 차이가 확연해지는 순간, 욕망은 부정의 역량으로도, 대립의 요소로도 드러나지 않는다. 욕망은 오히려 물음을 던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어떤 탐색의 힘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욕구와 만족의 장과는 다른 장에서 전개되는 힘이다. 물음과 문제들은, 전적으로 잠정적인 자격에 머물며 경험적 주체의 순간적 무지를 표시하는 어떤 사변적 활동들이 아니다. 물음과 문제들은 어떤 살아 있는 활동들이고, 이 활동들을 통해 무의식이 지닌 특별한 종류의 객관성들이 활력을 띠게 되지만, 이 활동들은 이와 달리 대답과 해답들에 영향을 미치는 잠정적이고 부분적인 상태에서 수명을 이어갈 운명에 있다. 문제들은 현실의 계열들을 구성하는 항과 관계들의 상호 변장과 '교감하고' 있다. 물음들은 문제들의 원천이며, 계열들이 전개되는 기준점인 잠재적 대상의 전치와 교신하고 있다. 잠재적 대상에 해당하는 팔루스는 수수께끼와 알아맞히기 놀이들을 통해 항상 자신이 없는 자리에서 표시된다. 이는 정확히 팔루스가 자신의 전치 공간과 구별되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오이디푸스의 갈등들조차 일단은 스핑크스의 물음에 의존하고 있다. 탄생과 죽음, 성별의 차이 등은 단순한 대립항들이기 이전에 문제들을 제기하는 복합 테마들이다. 문제와 물음은 대답들에 대해 초월적 위치에 있고, 해답들을 관통해 끈덕지게 자신을 주장하고 있으며, 특정한 방식으로 자신의 고유한 입 벌림 현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모든 물음들, 이런 모든 문제들 안에는 대단히 광적인 무언가가 있기 십상이다.
도스토예프스키나 체스토프에게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집요한 물음은 대답을 불러일으키기보다는 모든 대답을 침묵에 빠뜨리기에 족하다. 바로 여기서 물음은 자신의 고유한 존재론적 범위를 발견하고, 부정적인 것의 비-존재로 환원되지 않는 물음의 (비)-존재를 발견한다. 원초적인 혹은 궁극적인 대답이나 해답들이란 것은 없다.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물음-문제들뿐이고, 이는 모든 가면들 배후의 어떤 가면, 모든 장소들 배후의 어떤 자리바꿈 덕분이다. 삶과 죽음의 문제, 사랑과 성차의 문제 등이 과학적인 해답이나 입장들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믿음일 것이다. 설령 그런 문제들의 전개 과정에 이 입장이나 해답들이 어떤 순간 필연적으로 뛰어들거나 개입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 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문제들은 영원한 위장과 관련되고, 물음들은 영원한 전치와 관련된다. 신경증 환자, 정신병 환자들은 어쩌면 그들의 고통을 대가로 이 궁극적이고 원천적인 바탕을 탐험하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신경증 환자는 이렇게 묻는다. 어떻게 문제를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있을까? 반면 정신병 환자는 이렇게 묻는다. 어디에서 물음을 던질 수 있을까? 정확히 말해서 그들의 고통과 수난은 그 자체로 끊임없이 자리를 바꾸는 어떤 물음에 대한 유일한 대답이자 그 자체로 끊임없이 위장하는 어떤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변이다. 어떤 본보기가 될 수 있고 또 그들 자신을 넘어서는 것은 그들이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삶이다. p.244-246
무의식은 전락의 무의식도 모순의 무의식도 아니다. 무의식은 물음이나 문제들과 관련되어 있고, 이 물음이나 문제들은 해답-대답들과는 본성상 차이를 지닌다. 즉 무의식은 문제틀의 (비)-존재와 관계한다. 이 (비)-존재는 위에서 언급된 부정적 비-존재의 두 형식을 모두 거부한다. 그런 부정적 비-존재는 오로지 의식의 명제들만을 지배할 뿐이다. "무의식은 '아니요'를 모른다."라는 유명한 말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부분 대상들은 미세 지각들의 요소들이다. 무의식은 미분적이고 어떤 미세 지각들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바로 이 점에서 무의식은 의식에 대해 본성상의 차이를 지닌다. 무의식이 관계하는 문제나 물음들은 커다란 대립이나 그로부터 의식이 도출하는 총체적 효과들로 환원될 수 없다. p.247-248
사실 차이의 두 가지 형태, 곧 이동과 가장복, 전치와 위장은 반복 자체의 요소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때 전치를 통해서는 잠재적 대상이 상징적 변용을 겪고, 위장을 통해서는 -잠재적 대상이 합체되어 있는- 현실적 대상들이 상상적 변용을 겪는다. p.249
이때 나르키소스적 자아는 시간의 내용을 다른 내용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 번째 종합 안으로 들어와 있다. 말하자면 시간은 므네모시네의 모든 가능한 내용들을 포기했고, 이를 통해 에로스가 그 내용을 끌어들이던 원환을 깨뜨려버렸다. 시간을 펼쳐졌고 다시 세워졌으며 궁극의 형태를 취한다. 그 궁극의 형태는 직선으로 이루어진 미로, 보르헤스가 말하는 것처럼 "볼 수 없고 끝없이 이어지는" 미로이다. 빗장이 풀린 텅빈 시간은 철저히 형식적이고 정태적인 순서, 압도적인 총체[집합], 비가역적인 계열을 이루고 있다. 이런 시간은 정확히 죽음본능이다. 죽음본능은 에로스와 더불어 어떤 하나의 원환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죽음본능과 에로스는 겨로 상호 보충적이거나 적대적인 관계에 놓이는 법이 없다. 죽음본능은 결코 어떤 방식으로도 에로스와 대칭을 이루지 않는다. 죽음본능은 결코 어떤 방식으로도 에로스와 대칭을 이루지 않는다. 죽음본능은 다만 전적으로 다른 또 하나의 종합을 증언할 뿐이다. 이제 에로스와 므네모시네의 상관관계는 대체될 운명에 있다. 그것을 대체하는 것은 나르키소스적 자아와 죽음본능의 상관관계이다. 이때 나르키소스적 자아는 기억을 지니지 않는, 지독한 건망증 환자이다. 반면 죽음본능은 사랑을 지니지 않는, 탈성화된 상태에 있다.p.253
그런데 죽음을 물질의 객관적 규정으로 환원하는 것은 어떤 편견을 드러낸다. 그 편견에 따르면 반복의 궁극적 원리는 이차적이거나 대립적인 차이의 전치와 위장들 저편에 있는, 아직 분화되지 않은 어떤 물질적 모델 안에서 찾아야 한다. 그러나 실은 무의식의 구조는 갈등적 구조도, 대립적이거나 모순적인 구조도 아니다. 무의식의 구조는 다만 물음과 문제를 이루는 구조일 뿐이다. p.255
죽음은 생명체가 곧 '되돌아갈' 어떤 무차별하고 무기적인 물질의 객관적 모델 안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죽음은 생명체 안에 현전하고, 어떤 전형을 갖춘 주관적이고 분화된 경험으로 현전한다. 죽음은 어떤 물질적 상태에 응답하지 않는다. 거꾸로 죽음은 모든 물질을 전적으로 포기한 어떤 순수한 형식 -시간의 텅 빈 형식- 에 상응한다. (또한 반복을 어떤 족어 있는 물질의 왜생적 동일성에 종속시키든 어떤 불사의 영혼의 내생적 동일성에 종속시키든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것은 모두 신간을 채우는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죽음이 부정으로도, 대립의 부정성으로도, 제한의 부정성으로도 환원되지 않기 때문이다. 죽음의 전형은 일정한 수명의 생명이 물질 앞에서 겪는 제한에서 오는 것도, 불멸의 생명과 물질 사이의 대립에서 오는 것도 아니다. 죽음은 차라리 문제틀의 마지막 형식이고, 문제와 물음들의 원천이며, 모든 대답 위에서 문제와 물음들이 항구적으로 존속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표지이다. 죽음은 (비)-존재를 지칭하는 "언제 그리고 어디서?"이고, 모든 긍정은 그렇게 지칭되는 이 (비)-존재에서 자양분을 얻고 있다. p.255-256
반면 두 번째 측면에서 보면 죽음은 '자아'와는 무관한, 기이하게도 비인격적인 죽음이다. 이 죽음은 현재의 죽음도 과거의 죽음도 아닌, 다만 항상 도래하고 있는 죽음이다. 이 죽음은 끈덕지게 항존하는 어떤 물음 안에서 다채롭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어떤 모험의 원천이다. "죽는다는 사실은 어떤 급진적인 전복을 끌어안고 있다. 이 전복을 통해 내 능력의 극단적 형식이던 죽음은 박탈하는 어떤 것이 된다. 시작하고 끝내는 내 능력의 바깥으로 나를 내던지는 가운데 내게서 그런 능력을 박탈해가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죽음은 다시 나 자신과 무관한 것, 나에게 전적으로 무능력한 것, 모든 가능성을 잃어버린 것, 곧 실재성을 결여한 무한정자가 된다. 나는 이 전복을 표상할 수 없고 심지어 결정적인 것으로 포착할 수도 없다. 이 전복은 그것의 저편을 지나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비가역적인 이행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완료되지 않는 것, 종료할 수 없는 것, 끝없이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현재가 없는 시간이다. 나는 이 시간과 관계하지 않는다. 나는 이 시간을 향해 뛰어들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시간 안에서) 나는 죽지 않기 때문이고 죽을 능력을 빼앗겼기 때문이다. (그 시간 안에서) 죽는 것은 익명인 아무개이다. 거기서 익명인은 끊임없이 죽고 또 멈추지 않고 죽는다. ......그것은 끝나는 지점이 아니라 다만 끝낼 수 없는 것, 고유한 죽음이 아니라 다만 그 어떤 하찮은 죽음, 진정한 죽음이 아니라 다만 카프카가 말하는 치명적인 과오에 대한 비웃음이다." p.256-257
사유는 후천적으로 습득할 필요도 없고 선천적 능력인 양 행사할 필요도 없다. 오히려 필요한 것은 사유 자체 안에서 사유하는 활동을 분만하는 것이다. p.259
이제 무의식을 구성하는 이 세 가지 종합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이 세 가지 종합은 어떤 위대한 소설가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반복의 형태들에 상응한다. 가령 끈, 항상 새롭게 바뀌는 노끈과 항상 자리를 바꾸는 벽의 얼룩, 그리고 언제나 닳아 없어지는 지우개가 그런 형태들에 해당한다. 끈-반복, 얼룩-반복, 지우개-반복. 이것이 쾌락원칙을 넘어서는 세 가지 반복의 형태이다. 첫 번재 종합은 살아 있는 현재 위에 시간을 정초한다. 이 정초 위에서 쾌락은 경험적 원리의 가치 일반을 획득하고, 이드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신 생활의 내용은 이 원리의 지배를 받는다. 두 번째 종합은 순수 과거를 통해 시간을 근거짓는다. 이 근거에 의해 쾌락원칙의 적용 범위는 자아의 내용으로 제약된다. 하지만 세 번재 종합은 무-바탕을 지칭한다. 근거를 통해 우리는 이 무-바탕으로 추락하게 된다. 즉 타나토스는 세 번째 위치에서, 하비투스의 정초와 에로스의 근거 저편에 있는 이 무-바탕으로서 발견된다. 또한 타나토스는 쾌락원칙과 관계하지만, 이 관계를 통해 그 원칙은 혼란에 빠진다. p.260
영원회귀는 긍정하는 역량이다. 영원회귀는 다양한 모든 것, 차이나는 모든 것, 우연한 모든 것을 긍정한다. 하지만 이것들을 일자, 같음, 필연성에 종속시키는 것은 여기서 제외되고 하나인 것, 같은 것, 필연적인 것도 제외된다. 통설에 따르면, 일자는 결정적인 어떤 한 순간 다양한 것에 종속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 다양한 것은 바로 죽음의 얼굴이 아닐까? 하지만 죽음의 또 다른 얼굴을 통해, 결정적인 어떤 한 순간 작용하는 모든 것은 이제 다시 결정적인 어떤 한 순간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닐까? 만일 영원회귀와 죽음이 어떤 본질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면, 이는 영원회귀가 '결정적인 어떤 한 순간' 일자의 죽음을 부추기거나 암시하기 때문이다. 만일 영원회귀와 미래가 어떤 본질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면, 이는 미래를 통해 다양한 것, 차이나는 것, 우연한 것이 대자적 관계 안에서 '매 순간' 전개되고 주름을 펼쳐가기 때문이다. 영원회귀 안의 반복은 두 가지 규정을 배제한다. 종속시키는 위치에 있는 한 개념의 같음이나 동일성이 그 하나이다. 반복되는 것을 같음에 관계짓는 가운데 그 종속을 보장하는 조건의 부정성이 또 다른 하나이다. 영ㅇ원회귀 안의 반복은 개념에 동등하게-되기나 유사하게-되기를 배제한다. 동시에 그런 되기와 생성 배후에 있는, 결핍에 의한 조건을 배제한다. 반면 영원회귀 안의 반복은 [허상, 시뮬라크르에 해당하는] 어떤 과도한 체계들에 관련되어 있다. 이 체계들은 차이나는 것을 차이나는 것에, 다양한 것을 다양한 것에, 우연한 것을 우연한 것에 묶는다. 그리고 이런 묶기의 과정은 언제나 던져진 물음이나 취해진 결정들과 똑같은 외연을 갖는 어떤 긍정의 총체 안에서 이루어진다. 인간은 놀 줄 모른다는 말이 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일가? 그것은 심지어 어떤 우연이나 다양성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인간은 자신의 긍정이나 결정들을 잘못 생각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이 우연을 제한할 목적으로 긍정한다고 생각한다. 또 우연의 효과를 예방하기 위해서 결정을 내린다고 생각하고, 어떤 이득의 가설 아래 같은 사태가 복귀하도록 만들기 위해 재생산한다고 생각한다. 정확히 말해서 그것은 졸렬한 게임이다. 이 놀이에서는 이길 수 있는 만큼 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모든 우연이 긍정되지 ㅇ낳기 때문이다. 여기서 분할 규칙은 미리 확립된 특성을 지니는데, 이 특성은 결핍에 의한 조건과 짝을 이루고, 그 조건은 어느 조각이 나올지 모르는 놀이 참가자 안에 있다. 반면 미래의 체계는 신적인 놀이라 불러야 한다. 왜냐하면 규칙이 미리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고, 놀이가 이미 자신의 고유한 규칙들에 걸리기 때문이며, 노는 아이는 -모든 우연이 매번 그리고 언제나 긍정되어 있으므로- 항상 이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긍정은 한정하거나 제한하는 긍정이 아니다. 그것은 다만 던져진 물음들이나 이런 물음들을 낳는 결정들과 범위가 같은 긍정이다. 이런 놀이에서는 필연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 패가 반복된다. 자기 자신의 고유한 복귀 체계 안에 가능한 모든 조합과 규칙들을 끌어안고 있는 덕분에 그럴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이 차이와 반복의 놀이를 끌고 가는 것이 죽음본능이라고 할 때, 이 놀이에서 가장 멀리 나아간 것은 그 유별난 작품 전체를 통해 읽을 수 있는 보르헤스이다. "만일 복권이 강렬한 우연이고 코스모스 안으로 주기적으로 침투하는 카오스라면, 우연은 결코 추첨의 단계뿐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끼어드는 것이라 해야 옳지 않을까? 그 누군가의 죽음이 우연에 의해 초래되었으면서도 이 죽음을 둘러싼 상황 -은밀하게 준비된 죽음이라든지, 공개된 죽음이라든지, 한 시간이나 한 세기 연기된 죽음이라는 상황- 이 우연에 예속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닐까? 사실 추첨들의 횟수는 무한하다. 그 어떤 결정도 최종적인 것이 아니고, 모든 결정은 가지 모양으로 뻗어나간다. 무지한 자들은 무한하게 추첨을 하려면 무한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은 시간이 무한히 쪼개지는 것으로 충분하다....... 모든 허구 안에서 상이한 해법들이 제시될 때마다 인간은 그중 하나를 선택하고 나머지를 배제한다. 빠져나오기 힘든 취팽의 소설 속에서 인간은 모든 것을, 그것도 동시적으로 선택한다. 이렇게 해서 그는 상이한 미래들, 증식하고 또 분기해 가는 상이한 시간들을 창조한다. 그 소설의 모순들은 여기서 비롯된다. 예를 들면 팽은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데, 낯선 사람이 그의 방문을 두들기자 팽은 그를 죽이기로 결심한다. 이 이야기는 당연히 여러 가지 결말로 끝날 수 있다. 가령 팽이 침입자를 죽이거나, 침입자가 팽을 죽이거나, 둘다 살아나거나, 둘다 죽는 등의 여러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취팽의 작품에서는 이 모든 결말들이 함께 펼쳐진다. 각각의 결말은 또 다른 분기들의 출발점인 것이다." p.261-264
중요한 것은 그 즉자적 측면에서 볼 때 차이는 크든 작든 언제나 내적이라는 점이다. 어떤 체계들은 서로 커다란 외적 유사성을 지니면서 커다란 내적 차이를 가진 체계들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이 있다. 그것은 모순적인 것이다. 유사성은 항상 외부에 있고, 차이는 크든 작든 언제나 체계의 핵심을 형성하고 있다.
각 계열은 하나의 이야기를 형성한다. 가령 라이프니츠는 여러 관점들을 통해 도시를 바라보지만, 그런 식으로 서로 다른 복수의 관점에서 하나의 똑같은 이야기를 펼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구별되는 여러 이야기들이 동시적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기저에 놓인 계열들은 분기하고 발산한다. 하지만 그것은 길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충분히 어떤 수렴 지점을 찾을 수 있는 상대적 의미의 발산이 아니다. 그것은 절대적 의미의 발산이다. 여기서 수렴 지점, 수렴 지평은 어떤 카오스 안에 놓여 있고, 이 카오스 안에서 언제나 자리를 바꾸고 있다. 발산은 긍정의 대상이고, 그와 동시에 이 카오스 자체는 지극히 실증적이다. 카오스는 온-주름운동에 놓인 모든 계열들을 끌어안고 있는 '현자의 돌'과 구별되지 않는다. 이 지보는 동시적으로 성립하는 모든 계열들을 긍정하는 가운데 복잡하게 얽힌 온-주름으로 만든다. 온-주름운동, 밖-주름운동, 안-주름운동은 삼위일체를 이룬다. 일체를 이루는 체계 전체, 다시 말해서 카오스, 계열들, 분화소 등으로 이루어진 체계 전체는 이 삼위일체를 통해 해명될 수 있다 이 체계를 들여다보면, 모든 것을 끌어안고 있는 카오스의 안과 밖을 발산하는 계열들이 드나들고 또 분화소를 통해 서로 관계를 맺는다. 각 계열은 바깥으로 주름을 펼치거나 자신을 개봉한다. 하지만 이런 밖-주름운동이나 개봉운동은 각 계열과 다른 계열들 간의 차이 안에서 이루어진다. 각 계열은 자기 자신 안에 다른 계열들을 안-주름처럼 함축하고, 또 다른 계열들 안으로 안-주름처럼 함축된다. 각 계열은 자기 자신 안에 다른 계열들을 봉인하고, 또 다른 계열들 안으로 봉인된다. 이런 주름운동, 봉투운동은 모든 것을 복잡한 온-주름으로 만드는 카오스 안에서 이루어진다. 발산하는 계열들, 그 본연의 계열들은 단일한 통일성을 이루고, 그것이 곧 일체를 이루는 체계의 총체성이다. '문제'의 객관성은 그런 총체성에 상응하여 성립하고, 물음-문제들의 방법은 바로 여기서 비롯된다. 조이스는 바로 이 방법을 통해 자신의 작품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으며, 그보다 앞서 루이스 캐롤은 이미 그런 방식을 통해 혼성어들을 문제틀의 지위에 올려놓았다. p.278-279
이때 물어야 하는 것은 '사후성'의 현상이다. 다시 말해서 원초적인 것으로 가정되는 유아기의 장면은 오로지 그와 유사하고 또 파생적이라고도 불리는 어떤 성인기의 장면 속에서만 효력을 미친다. 거리를 두고 원격적으로 효력을 미치는 것인데, 이렇게 사후적인 효과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여기서 제기되고 있는 것은 두 게열 사이에서 일어나는 공명의 문제이다. 그러나 엄격하게 말하자면 이 문제는 제대로 제기되지 못했다. 아직 두 계열이 어떤 상호 주관적인 무의식 안에서 공존할 수 있음을 말해주는 심급이 계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유년기 계열과 성인기 계열, 이 두 계열은 하나의 똑같은 주체 안에서 할당되는 것이 아니다. 유년기의 사건은 현실적인 두 계열 중의 하나를 형성한다기보다는 차라리 어두운 전조를 형성하고, 기저의 두 계열은 이 전조를 통해 서로 소통하게 된다. 우리가 어린 시절 알고 있던 어른들의 계열, 그리고 현재 우리가 다른 어른들, 다른 어린아이들과 더불어 속해 있는 성인 계열이 소통하게 되는 것이다. p.280-281
환상은 어린아이가 어두운 전조로거 모습을 드러내는 사건이다. 그리고 환상 속에 어떤 근원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계열과 관계하고 있는 어떤 한 계열에 있지 않다. 근원적인 것은 계열들의 차이에 있다. p.282
*주 67 - 자크 데리다는 특히 프로이트의 환상과 관련하여 이렇게 쓴다. "그러므로 근원적인 것은 이 사후적 지연이다. 이것이 없다면 차연은 의식이나 현재의 자기 현전이 이용하는 미루기에 불과할 것이다. (차연이)근원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현전 상태의 기원이 있다는 신화를 지워버리는 것과 다름없다. 그렇기 때문에 '근원적'이라는 말은 말소 표시 아래에 새겨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차연은 어떤 충만한 기원의 파생물로 전락한 것이다. 근원적인 것은 비-기원이다." 그 밖에 모리스 블랑쇼도 참조. "이미지는 이른바 첫 번째 대상이라는 것 다음의 두 번째에 오는 것이 아니다. 이미지는 그런 위치에서 벗어나 어떤 특정한 우선권을 요구해야 하고, 동시에 이와 더불어 근원적인 것과 기원은 창시적인 역량들을 독점하던 여러 특권들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 더 이상 근원적인 것은 없다. 있는 것은 어떤 영원한 섬광뿐이다. 이 섬광 안에서 부재하는 기원은 작열하는 우회와 복귀를 통해 산산히 흩어지고 있다." p.283
플라톤은 영원회귀를 어떤 규율 안에 가두어놓으려고 무진 애를 썼고, 이를 위해 영원회귀를 이데아들에서 비롯되는 어떤 효과로 만들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원형을 모사하도록 만들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모사에서 모사로 이어지는 운동, 그 타탁해가는 유사성의 무한한 운동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의 본성이 변질되는 지점에 이른다. 여기서는 모상 자체가 허상으로 전도되고 유사성, 정신적 모방은 마침내 반복에 자리를 내주기에 이른다.
모든 인식능력들이 재인 일반 안에서 서로 협력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상호 협력을 표현하는 정식들은 경우에 따라 달라진다. 재인되어야 하는 것, 가령 인식 대상, 도덕적 가치, 심미적 효과...... 등의 조건들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칸트는 공통감의 형식을 전복하기는커녕 오히려 복수화했을 뿐이다. (현상학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해야 하지 않을까? 현상학은 제 4의 공통감, 수동적 종합으로서의 감성에 정초를 두고 있는 공통감을 발견한 것이 아닐까? 하지만 이 새로운 공통감은 어떤 원초적 독사를 구성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독사의 형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닐까?) p.308
그렇기 때문에 재현의 세계는 차이 그 자체를 사유하는 데는 물론이고 또한 반복을 그 대자적 측면에서 있는 그대로 사유하는 데 무능력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왜냐하면 여기서 반복은 재인, 할당, 재생산, 유사성 등을 통해서만 파악되기 때문이고, 게다가 이것들이 접두사 재RE를 재현의 단순한 일반성들 안으로 소외시키는 한에서만 파악되기 때문이다. p.311
이 요소는 곧 강도이고, 이 강도는 순수한 즉자적 차이에 해당한다. 이런 강도는 경험적 차원의 감성에 대해서는 감각 불가능하다. 이 수준에서 감성은 강도를 파악하지만, 그렇게 파악된 강도는 언제나 스스로 창조한 질에 의해 이미 뒤덮여 있거나 매개되어 있다. 그렇지만 마주침 안에서 강도를 직접적으로 포착하는 초월적 감성의 관점에서 보면, 이 요소는 동시에 오로지 감각밖에 될 수 없다. 또 감성이 자신이 겪는 강제력을 상상력으로 전달하고, 그래서 이제는 상상력이 초월적 실행으로 고양될 때, 상상되어야 할 것, 오로지 상상밖에 될 수 없는 것이자 경험적으로는 상상 불가능한 것을 구성하는 것은 환상이고 환상 안의 불균등성이다. p.323
사유는 오로지 "사유를 야기하는" 것, 사유되어야 할 것에 직면하여 겪게 되는 강제와 강요의 상태에서만 사유할 따름이다. 또 여기서 사유되어야 할 것이란 또한 사유 불가능자 혹은 비-사유이고, 다시 말해서 (시간의 순수 형식에 따라) "우리는 아직 사유하지 않는다."라는 영속적인 사실이다. p.324
아르토에 따르면, (그에게) 문제는 자신의 사유에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사유하는 것에 대해 완벽한 표현을 찾는 데 있는 것도 아니다. 응용과 방법을 얻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시들에 대해 최대한의 완성도를 추구하는 데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문제는 그저 무엇인가를 사유하기에 이르는 데 있다. 그의 경우에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작업"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작업은 사유하기의 충동이나 강박을 가정한다. 모든 종류의 분기점들을 거쳐 가는 이 충동이나 강박은 신경들로부터 출발하고, 영혼으로 소통해 들어가다 마침내 사유에 도달하게 된다. 이때부터 사유가 사유하도록 강요받는 것은 결국 사유 자체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붕괴, 사유 자체의 균열, 사유에 고유한 자연적 "무능"이다. 이런 무능은 사유의 가장 커다란 역량과 구별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사유되어야 할 것들, 아직 말로 표현되지 않은 이 힘들과 구별되지 않는 것이고, 이 힘들은 그대로 사유의 절도나 불법 침입에 해당한다. 이 모든 점에서 아르토는 끔찍스럽게 드러나는 어떤 이미지 없는 사유를 추구하고, 또 재현을 용납하지 않는 어떤 새로운 권리를 끝까지 장악하고자 한다. 그는 본연의 어려움과 이것에 뒤따르는 문제와 물음들이 사실적 차원의 사태가 아니라 사유의 권리적 구조임을 안다. 기억상의 기억상실증 환자, 언어상의 실어증 환자, 감성상의 지각불능증 환자 등과 마찬가지로 사유상의 무두인이 있음을 안다. 그는 사유하기가 보늉적으로 타고난 것이라기보다 사유 속에서 분만되어야 하는 것임을 안다. 그는 문제가 본성상 그리고 권리상 선재하는 어떤 사유를 방법적으로 지도하거나 응용하는 데 잇는 것이 아니라 다만 아직 현존하지 않는 것을 낳는 데 있음을 안다.(이와 다른 작업은 없고, 여타의 모든 것은 임의적이며, 또 장식에 불과하다.) 사유한다는 것은 창조한다는 것이고, 그 밖에 다른 창조는 없다. 하지만 창조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사유 속에 '사유하기'를 낳는 것이다. p.329-330
어리석음이 가능한 것은 사유와 개체화를 묶어주는 연계성 덕분이다. 이 연계성은 이미 사유하는 주체의 감성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강도장 속에서 생긴다. 사실 나 혹은 자아는 아마 종을 가리키는 어떤 표지들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그것은 종과 유기체적 부분들로서의 인류를 나타내는 표지들이다. 아마 인간 안에서 종은 암묵적인 상태로 이행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형상으로서의 나는 재인과 재현에 대해 보편적 원리의 구실을 할 수 있는 반면, 명시적인 종적 형상들은 단지 나에 의해서만 재인될 수 있고, 종별화는 재현의 요소들 중 한 요소의 규칙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종이 아니다. 하지만 이는 차라리 그것이 유와 종들에 의해 명시적으로 개봉되는 것, 곧 형상의 재현된 생성을 암묵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우독소스와 에피스테몬, 이들의 운명은 같다. 반면 개체화는 종별화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종별화를 아무리 멀리 끌고 간다 해도 마찬가지다. 개체화는 본성상 모든 종별화와 다를 뿐 아니라, 또 앞으로 보게 될 것처럼 모든 종별화를 가능케 하고 모든 종별화에 선행한다. 개체화는 유동하는 강도적 요인들의 장들 속에서 성립하고, 이 장들은 게다가 나나 자아의 형상에 아예 빚지지 않는다. 모든 형상들 밑에서 이루어지는 본연의 개체화는 어떤 순수한 바탕과 분리될 수 없고 이 바탕은 개체화를 통해 위로 솟게 되며 개체화에 이끌려간다. 이 바탕을 서술하고 이 바탕이 야기하는 공포와 매력을 동시에 묘사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바탕을 휘젓는다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작업이지만, 또한 어떤 우둔한 의지의 아연한 순간들에서는 지극히 매혹적인 작업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이 바탕은 개체와 더불어 표면으로 올라오면서도 형상이나 형태를 취하지 안힉 때문이다. 바탕은 눈이 없지만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킨다. 개체는 바탕에서 벗어나 어떤 구별되는 형태를 취하려 하지만, 바탕은 개체와 떨어지려고 하지 않는다. 자신과 이혼하는 것과 더불어 끊임없이 결혼하는 것이다. 대지와 신발의 관계에서 그런 것처럼, 바탕은 규정되지 않은 것이지만 규정을 계속 끌어안는 한에서 미규정적이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동물들은 자신들의 명시적인 형상들 덕분에 이 바탕의 위험에서 벗어나 있다. 나와 자아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개체화의 장들이 괴롭히고 또 침식해 들어가는 나와 자아는 바탕의 상승 앞에 무력하다. 그렇게 상승하는 바탕은 나와 자아에게 형태를 왜곡하고 일그러뜨리는 거울을 들이밀고, 이런 바탕에서는 지금 사유되고 있는 모든 형상들이 용해되어버린다. 어리석음은 바탕도 개체도 아니지만, 그 둘을 묶는 어떤 관계이다. p.338-339
근거짓는다는 것은 곧 변신케 한다는 것이다. 의미는 결코 어떤 지칭에 대해 무관심한 채 남아 있으면서 그 지칭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며, 참과 거싲도 그와 같은 단순한 지칭과 관련되어 있지 않다. 명제와 그것이 지칭하는 대상의 관계는 의미 자체 안에서 확립되어야 한다. 이 이념적 의미의 특성은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바로 그 지시된 대상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다. 지칭 -하나의 참된 명제의 경우에 이루어지는 지칭- 이 근거지어지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무엇보다 먼저 의미를 구성하는 발생적 계열이나 이념적 연관들의 한계로서 사유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의미가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대상을 향해 나아간다면, 이 대상은 더 이상 의미의 외부에 해당하는 현실 속에 설정될 수 없으며 다만 그 의미 과정의 한계로서 설정될 수 있을 뿐이다. p.344
의미는 명제에 의해 표현되는 것이다. 그러나 표현되는 것이란 무엇인가? 표현되는 것은 지칭되는 대상으로도, 표현하는 자의 체험 상태로도 환원되지 않는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의미와 의미작용을 구별하기까지 해야 한다. 먼저 의미작용이 가리키는 것은 개념이자 이 개념이 재현의 장 속에서 조건화되어 있는 어떤 대상들과 관계하는 방식이다. 반면 의미는 재현 이하의 규정들 안에서 개봉되는 이념과 같다.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보다는 무엇이 아닌지를 말하는 것이 훨씬 쉽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사실 우리는 결코 하나의 명제와 그 명제의 의미를 동시에 정식화할 수 없으며, 우리는 결코 우리가 말하는 것의 의미를 말할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의미는 진정 말해져야 할 것이고, 겅험적 사용 안에서는 말해질 수 없는 것, 단지 초월적 사용 안에서만 말해질 수 있는 것이다. 모든 인식능력들을 주파하는 이념은 의미로 환원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념은 또한 무-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 이념은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는 어떤 구조적인 요소들에 의해 구성되지만, 이념 그 자체는 자신이 생산하는 모든 것의 의미를 구성하며(구조와 발생), 이런 이중적 측면을 화해시키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자기 자신과 자신의 의미가 동시에 말해지는 단어는 단 하나뿐이다. 그것은 바로 아브락사스, 스나크, 혹은 빌리투리 등과 같이 무의미한 단어이다. 또 만일 의미가 인식능력들의 경험적 사용에 대해서는 필연적으로 어떤 무-의미라면, 거꾸로 경험적 사용 안에서 그토록 빈번하게 나타나는 무-의미들은 양심적인 관찰자에 대해서는 의미의 비밀과도 같다. 이런 관찰자는 자신의 모든 인식능력들을 어떤 초월적 한계를 향해 내밀고 있다. 이미 많은 작가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간파했던 것처럼, 무-의미의 매커니즘은 의미의 최고 목적이고, 이는 어리석음의 매커니즘이 사유의 최고 목적인 것과 같다. p.345-346
의미와 문제
부정사 형식이나 분사 형식보다는 차라리 어떤 질문의 형식을 통해 의미를 표현한다면 무언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가령 신-존재하기나 신의 존재함이 아니라 오히려 "신은 존재하는가?") 언뜻 보기에는 얻는 것이 별로 없다. 하지만 이는 질문이란 것이 언제나 어떤 주어질 법한 대답들, 있을 법하거나 가능할 법한 대답들을 기초로 전사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질문 그 자체는 선재한다고 가정된 어떤 명제의 중성화된 분신이고, 이 명제는 대답의 구실을 할 수 있거나 해야만 한다. p.349
질문의 형식은 우리로 하여금 해당 명제를 어떤 대답으로 간주하도록 유도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길을 열어놓는다. 대답으로 파악된 명제는 언제나 해의 특수한 경우이다. 이 특수한 경우는 다른 경우들과 함께 자신을 어떤 본연의 문제와 관련짓는 상위의 종합과 분리되어 그 자체만이 추상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그러므로 질문이란 것은 상이한 것으로 포착된 해의 경우들에 따라 하나의 문제가 경험 안에서, 그리고 의식에 대해 분해, 환전, 왜곡되는 방식을 표현한다. 그래서 질문은 어떤 불충분한 관념을 심어주는 것으로 그친다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신이 분해하고 있는 것에 대한 예감을 불러일으킨다. p.350
보통 문제나 물음은 단지 해당 명제의 중성화에 불과하다고 여겨져왔다. 따라서 주제나 의미가 단지 어떤 무기력한 분신에 불과하다는 것, 다시 말해서 자신이 포섭하는 명제들의 유형을 기초로 전사된 분신이자 심지어 모든 명제에 공통된다고 추정되는 요소(표지적이거나 지표적인 테제)를 기초로 전사된 분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사람들은 의미나 문제가 명제 외적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또 의미나 문제가 본성상 모든 명제와 다르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까닭에 본질적인 것을 놓칠 뿐 아니라 사유 행위의 발생, 인식능력들의 사용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p.351
*주31 - 이와는 반대로 라이프니츠는 문제나 주제[테마], 그리고 명제 사이에 있는 가변적이지만 언제나 심층적인 간격을 예감한다. "심지어 하나의 관념과 하나의 명제 사이의 중간에 해당하는 어떤 주제들이 있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 이 주제들은 물음들이고, 이 물음들 중의 일부는 단지 예와 아니요만을 요구한다. 이런 것들은 명제들에 가장 근사한 물음들이다. 하지만 어떤 다른 일부는 '어떻게'와 상황들 등을 요구한다. 이런 물음들을 명제들로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을 보충해야 한다. p.352
더구나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문제임을 '인정'한다. 하지만 이런 사실상의 인정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이는 마치 문제라는 것이 앎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사라져버릴 예정의 어떤 잠정적이고 우발적인 운동에 불과하고, 이런 운동의 중요성은 단지 인식하는 주체가 종속되어 있는 부정적인 경험적 조건들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다. p.354
분석론은 삼단논법이 필연적인 결론을 끌어내는 과정을 연구하지만, 변증론은 삼단논법의 대상들(아리스토텔레스가 바로 문제들이라 부르는 것들)을 고안하고 하나의 대상과 관련된 삼단논법의 요소들(명제들)을 분만한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문제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나 대부분의 사람들, 혹은 지혜로운 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의견들"을 생각해보도록 권유한다. 이렇게 해서 그 의견들을 어떤 일반적인 관점들과 관련짓고, 또 그래서 어떤 논의가 있을 경우 이 의견들을 확정하거나 반박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장소들을 형성해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공통의 장소들은 공통감 자체의 검증이다. 여기서 해당 명제가 우유성, 유, 고유성이나 정의 등과 관련된 어떤 논리적 결함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런 문제는 모두 거짓 문제로 간주될 것이다. 만일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변증론이 평가 절하되고 그럴듯하게 보이는 단순한 의견이나 독사들의 수준으로 환원되는 것처럼 보인다면, 이는 그가 변증론의 본질적인 과제를 잘못 파악했기 대문이다. 그는 자연적 가상에 사로잡혀 공통감의 명제들을 기초로 문제들을 전사하고, 철학적 가상에 사로잡혀 문제들의 진리를 공통의 장소들, 다시 말해서 어떤 해를 받아들일 논리적 가능성에 의존하도록 만들고 있다. p.356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문제들의 한복판에서 진리가 발생하고 사유 안에서 참된 것이 생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라는 것은 사유 안의 미분적 요소이고 참된 것 안의 발생적 요소이다. p.359
하지만 원리상 변증법적인 것은 문제이고 원리상 과학적인 것이 해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좀 더 완결성을 딘 방식에 준하여 이렇게 구분해야 한다. 먼저 초월적 심급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상징적 장이 있으며, 이 장에서는 내재성의 운동에 놓인 문제의 조건들이 표현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해결 가능성의 장이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구현된느 것이고 방금 언급된 상징성도 이 장을 중심으로 정의된다. 이 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정확히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문제와 그에 상응하는 이념적 종합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이론밖에 없을 것이다. p.364
기호 안에서 이루어지는 감성의 역설적 사용은 이념들에 의존하고, 이 이념들은 모든 인식능력들을 주파할 뿐 아니라 이 능력들을 번갈아가며 일개운다. 거꾸로 이념은 인식능력들 각각의 역설적 사용에 의존하고, 또 그 자신이 언어에 의미를 제공한다. 이념을 탐험한다는 것과 인식능력들 각각을 초월적 실행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은 결국 똑같은 일이다. 이것은 배움, 본질적인 학습의 두 측면이다. 왜냐하면 배우는 자는 실천적이거나 사변적인 어떤 본연의 문제들을 구성하고 공략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 첫 번째 측면에서 볼 때 배움은 문제의 객체성과 마주하여 일어나는 주관적 활동들에 부합하는 이름인 반면, 앎은 개념의 일반성을 지칭하거나 해들의 규칙을 소유하고 있는 평온한 상태를 지칭한다. p.365
방법은 모든 인식능력들의 협력을 조정하는 앎의 수단이다. 또한 방법은 어떤 공통감의 표출이거나 어떤 자연적 사유의 실현으로서, 어떤 선한 의지를 전제하고 이 의지는 사유 주체가 '미리 숙고해서 내린 결정'에 해당한다. 하지만 교양은 배움의 운동, 비자발적인 것의 모험이다. 이 운동과 모험은 어떤 감성, 어떤 기억,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사유 등을 여기에 필요한 모든 폭력을 통해 차례로 엮어가고, 마침내 니체가 말한 것처럼 바로 "일군의 사유자들의 훈련", "정신의 훈육"으로 귀결된다. p.367
사유의 초월론적 조건들은 앎이 아니라 '배움'을 기초로 조성되어야 한다. 플라톤이 이 조건들을 본유성이 아니라 상기의 형식을 통해 규정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리하여 사유 안으로 어떤 시간이 도입되고 있지만, 이 시간은 어떤 경험적 시간이 아니다. 사유 주체가 사실상의 조건들에 종속되어 있고 사유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적해야 하는 그런 경험적 시간이 아닌 것이다. 그것은 오히려 순수사유의 시간 혹은 권리상의 조건에 해당하는 시간이다. (시간은 사유를 필요로 하고 맞아들인다.) p.368-369
"앎은 어떤 경험적 형태에 불과하고 경험 속으로 거듭 떨어져 나오는 어떤 단순한 결과에 지나지 않지만, 배움은 어떤 초월론적 구조이다. 이 구조를 통해 차이와 차이, 비유사성과 비유사성이 서로 매개됨 없이 하나로 묶이고 시간은 사유 안으로 도입된다. 그러나 이 시간은 텅 빈 시간 일반의 순수 형식일 뿐, 이러저러한 신화적 과거나 이러저러한 사라진 신화적 현재가 아니다." p.369
공준들의 요약: 차이와 반복의 철학을 가로막는 장애물로서의 공준들
우리는 모두 여덟 가지의 공준을 검토했고, 각각의 공준은 언제나 두 가지 형태를 지닌다. 1) 원리의 공준 혹은 보편적 본성의 사유 Cogitatio natura universalis(사유 주체의 선한 의지와 사유의 선한 본성)라는 공준. 2) 이상의 공준 혹은 공통감(인식능력들의 조화로운 일치concordia facultatum로서의 공통감과 이 일치를 보증하는 할당으로서의 양삭)의 공준. 3) 모델의 공준 혹은 재인(모든 인식능력들을 똑같다고 가정된 하나의 대상에 대해 적용되도록 유도하는 재인, 그리고 할당의 수준에서 한 인식능력이 자신의 대상들 중의 하나를 다른 인식능력의 어떤 다른 대상과 혼동할 때 일어나는 오류가능성)의 공준. 4)요소의 공준 혹은 재현(이때 차이는 같은 것과 유사한 것, 유비적인 것과 대립적인 것의 보충적인 차원들에 종속된다.)의 공준. 5) 부정적인 것의 공준 혹은 오류의 공준.(여기서 오류는 사유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잘못된 모든 것을 동시에 표현하지만, 이 모든 것은 언제나 외적인 메커니즘들의 산물이다.) 6) 논리적 기능의 공준 혹은 명제의 공준.(지칭은 진리의 장소로 간주되고, 의미는 단지 명제의 중성화된 분신이나 무한정한 이분화에 불과하다.) 7) 양상의 공준 혹은 해들의 공준.(문제는 내용상 명제들을 기초로 전사되거나 형식상 해결 가능성에 의해 정의된다.) 8) 목적이나 결과의 공준, 앎의 공준(앎에 대한 배움의 종속성과 방법에 대한 교양의 종속성). 만일 각각의 공준이 두 가지 형태를 지니고 있다면, 이는 그것이 한번은 자연적인 공준이고 다른 한번은 철학적인 공준이기 대문이며, 한번은 임의적인 사례들을 통해 등장하고 다른 한번은 전제되고 있는 본질을 통해 등장하기 때문이다. 공준들이 굳이 말해질 필요는 없다. 공준들은 이 사례들이 선택될 때는 물론이고 그 본질이 전제될 대 침묵을 지키고 있을수록 훨씬 더 효과적으로 힘을 발휘한다. 이 공준들은 모두 함깨 사유의 독단적 이미지를 형성한다. 이 공준들은 재현 안의 같음과 유사성의 이미지를 통해 사유를 압살해버리지만, 이 이미지가 가장 심층적인 수준에서 훼손하는 것은 사유하기의 의미에 있다. 이 이미지는 차이와 반복, 철학적 시작과 재시작이라는 두 가지 역량을 소외시키면서 사유하기의 의미를 왜곡한다. 사유는 사유 안에서 태어난다. 사유하기의 활동은 본유성 안에 주어지는 것도, 상기 안에서 가정되는 것도 아니다. 그 활동은 다만 사유의 생식성 안에서 분만될 뿐이다. 이런 사유는 이미지 없는 사유이다. 하지만 이미지 없는 사유란 어떤 사유인가? 이와 같은 사유는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 세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p.370-371
그리고 독단주의의 오류가 분리하는 것을 언제나 메우는 데 있다면, 경험주의의 오류는 분리된 것을 외부에 방치하는 데 있다. p.378
요컨대 극한이나 경계는 함수의 극한이 아니라 어떤 진정한 절단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극한은 함수 자체 안에서 변화하는 것과 변화하지 않는 것 사이의 어떤 경계로 파악되어야 한다. 따라서 뉴턴의 오류는 미분들을 [곧 dx와 dy를] 제로와 등치시킨다는 데 있다. 반면 라이프니츠의 오류는 미분들을 개체나 변이 가능성과 동일시한다는 데 있다. 이렇게 볼 때 보르다스는 이미 미분법에 대한 현대적 해석에 접근하고 있다. 즉 극한은 더 이상 연속적 변수나 무한한 근사치 등의 관념을 전제하지 않는다. 그와는 달리 극한이라는 기초개념은 연속성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근거짓는다. 그 개념을 통해 연속성에 대한 정태적이고 순수하게 이념적인 정의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극한 개념 자체가 정의되어야 한다면, 정의상 그것이 함축하는 것은 오로지 수이거나 , 혹은 차라리 그 수 안의 보편자일분이다. 현대 수학자들은 이 보편자의 본성을 정확하게 한정하는 데 성공했다. 가령 그 본성은 '절단'에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절다능ㄴ 수의 근접 유를 구성하고 연속성의 이념적 원인이나 양화 가능성의 순수 요소를 구성한다. p.381-382
마이몬이 내놓은 양자택일의 선택지를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직선은 가장 짧은 거리"라는 유명한 예를 생각해보자. 가장 짧은 것은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먼저 그것은 조건화의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다. 이때 그것은 개념에 일치하여 공간을 규정하는 상상력의 도식에 해당한다.(자신의 그 어느 부분에서건 자기 자신과 포개질 수 있다고 정의된 직선.) 그리고 이 경우 차이는 외부적인 것으로 남고, 개념과 직관 '사이에서' 수립되는 어떤 구성 규칙을 통해 구현된다. 다른 한편 가장 짧은 것은 발생의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다. 이때 그것은 개념과 직관의 이원성을 극복하고 직선과 곡선의 차이 역시 내면화하는 어떤 이념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이념은 최소 조건들을 따르는 어떤 적분 안에서 이런 내적 차이를 상호적 규정의 형식을 통해 표현한다. 가장 짧은 것은 더 이상 도식이 아니라 이념이다. 혹은 그것은 더 이상 한 개념의 도식이 아니라 이념적인 도식이다. 이런 관점을 공유하는 수학자 우엘의 언급에 따르면, "가장 짧은 거리"는 결코 유클리드적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아르키메데스적 개념이고, 수학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물리학적 개념이다. 그것은 거진법과 분리될 수 없고, 직선을 규정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직선을 이용하여 곡선의 길이를 규정하는 데 쓸모가 있다 - "적분을 모르면서도 적분을 수행할 수 있다." p.386
문제는 자기 자신의 존재와 할당을 가리고 있는 해 안에 참여한다. 이런 사실을 통해 증언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문제의 초월성, 그리고 문제가 해들 자체의 조직화에서 떠맡는 지도적 역할이다. 요컨대 한 문제의 완결된 규정은 규정적인 점들의 실존, 수, 할당 등과 서로 구별되지 않는다. 바로 이 점들이 정확히 완결된 규정의 조건들을 제공하는 것이다. p.393
사실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문제 이론이 빠져드는 순환이다. 즉 문제는 '참된' 한에서만 해결될 수 있지만, 우리는 언제나 문제의 참됨을 그것의 해결 가능성을 통해 정의하려는 경향이 있다. 해결 가능성이라는 외생적 기준을 문제의 내부적 특성 안에서 근거짓는 대신 그 이념 내적 특성을 단순한 외부적 기준에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이와 같은 순환이 깨졌다면, 이는 무엇보다 수학자 아벨의 공로이다. 그가 공들여 완성한 방법에 따르면, 해결 가능성은 문제의 형식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하나의 방정식이 일반적으로 해결 가능한지 무턱대고 찾아나서는 대신, 해결 가능성의 장들을 점진적으로 한정해 가는 문제들의 조건들을 규정해야 하고, 이런 규정 과정을 통해 '언표가 해의 삭을 포함'하는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 바로 역서 문제-해 관계의 급진적 전복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코페르니쿠스적 혁명보다 훨씬 중요한 혁명이다. p.397-398
방정식의 군은 주어진 특정한 순간에 근들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특징짓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는 것의 객관성을 특징짓는다. 뒤집어서 말하면 이런 무지는 더 이상 어떤 부정적인 사태, 불충분한 사태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대상 안의 어떤 근본적인 차원과 이어지는 어떤 규칙, 어떤 배움이다. p.398-399
이념들은 언제나 특이점과 평범한 점들을 분배하고 있고, 충족이유의 종합적 점진과 진행을 형성하는 어떤 부가체들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는 어떠한 은유도 없다. 있다면 단지 이념과 동체를 이루는 은유, 곧 변증법적 운송이나 '운반diaphora'의 은유뿐이다. 이념들의 모험은 바로 이 운반에 있다. 다른 영역들에 응용되는 것은 결코 수학이 아니라 변증법이다. 변증법은 자신의 문제들에 대해 직접적인 미분법을 수립한다. 그 문제들의 수준과 조건들에 따라, 고려되는 영역에 상응할 뿐 아니라 그영역에 고유한 미분법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변증법의 보편성에는 어떤 보편수학이 응답하고 있다. 만일 이념이 사유의 미분이라면, 각각의 이념에 상응하는 어떤 미분법이 있는 것이며, 이때 그 이념은 사유한다는 것의 의미를 표현하는 알파벳에 해당한다. 미분법은 공리주의자의 단조로운 계산이 아니다. 사유를 다른 목적들은 물론이고 다른 사태에 종속시키는 투박한 산술법이 아닌 것이다. 미분법은 오히려 순수사유의 대수학, 문제들 자체의 고등 반어법이다 -그것은 "선악을 넘어서" 있는 유일한 계산법이다. 아직 더 기술할 것이 남아 있다면, 그것은 이념들이 지닌 바로 이런 모험에 찬 특성 전체이다. p.401
발생은 다만 잠재적인 것이 현실화되는 과정이다. 다시 말해서 발생은 구조가 구현되어 몸을 얻는 과정, 문제의 조건들이 해의 경우들로 나아가는 과정, 미분적 요소들과 이 요소들의 이상적 연관들이 매 국면 시간의 현실성을 구성하는 현실적인 항들과 상이한 실재적 결합관계들로 변화되는 과정이다. p.405
이런 역설감은 이념들을 요소로 하고 있다. 이는 정확히 이념들이 어떤 순수한 다양체들로서, 공통감 안의 어떠한 동일성 형식도 전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다양체들은 오히려 초월적 관점에서 인식능력들의 탈구적 실행을 살아있게 만들고 또 기술하고 있다. 그래서 이념들은 미분적 미과들의 다양체들이고, 말하자면 마치 도깨비불이나 '잠재적 여운의 불' 처럼 한 능력에서 다른 한 능력으로 옮겨 붙고 있지만, 결코 이 불은 공통감을 특징짓는 그 자연의 빛처럼 등질성을 지니지 않는다. p.425
하지만 '가장 급진적인 기원'이라는 말을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 그것은 이념들이 사유의 '미분들'이고 순수사유의 '무의식'이라 할 때와 똑같은 의미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는 사유가 그 어느 때보다 생생하게 공통감의 모든 형식들에 대립하는 순간에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이념들이 관계하는 것은 결코 의식의 명제나 근거에 해당하는 코기토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어떤 분열된 코기토의 나, 그 균열된 나이다. 다시 말해서 이념들은, 초월적 실행에 놓인 능력으로서의 사유를 특징짓는 바로 그 보편적 근거와해와 관계한다. 이념들은 어떤 특수한 능력의 대상은 아니지만 동시에 어떤 특수한 능력과 관련되어 있고, 이 점에서 독특한 것이다. 그래서 이념들은 (모든 능력들의 역설감을 구성하기 위해서) 그 능력들 바깥으로 외출하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지경이다. 그렇지만 다시 여기서 외출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또 기원을 발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념들은 어디로부터 오고 있는가? 문제들은, 그 문제들의 요소와 이상적 관계들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p.426-427
칸트는 [순수이성비판]에서 [실천이성비판]으로 이행할 때 그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플라톤적이다 앞의 작품은 가능한 경험의 가설적 형식에 전적으로 종속되어 있지만, 뒤의 작품에서 그는 문제들의 도움에 힘입어 어떤 정언적 원리의 순수한 필연성을 발견한다, 하물며 후기 칸트주의자들은 더욱 더 플라톤적이다. '비판'이 서있는 장소에서 그 비판 자체를 변화시키지도 않으면서 가언적[가설적] 판단을 정립적 판단으로 변형시키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플라톤에서 데카르트를 거쳐 피히테나 헤겔에까지 이르는 철학의 운동을 이처럼 요약한다고 해도 그렇게 부당한 일은 아니다. 출발점의 가설들과 도달점의 필증성들이 아무리 천차만별이라 해도, 철학의 운동은 늘 똑같은 궤적을 그리고 있다. 거기에는 어떤 최소한의 공통점이 있는 것이다. 즉 언제나 출발점과 도달점이 있고, 출발점은 어떤 '가설' 안에서, 다시 말해서 불확실성을 띤 어떤 계수에 의해 촉발된 의식의 명제(이는 데카르트의 회의일 수 있다.) 안에서 발견되는 반면, 도달점은 어떤 필증성이나 현저하게 도덕적인 차원의 어떤 명법(플라톤의 일자-선, 데카르트적 코기토의 속이지 않는 신, 라이프니츠의 최선의 원리, 칸트의 정언적 명법, 피히테의 자아, 헤겔의 "학") 안에서 발견된다. 그런데 이런 행보는 가장 멀리 나아간다 해도 사유의 진정한 운동을 겨우 스치고 지나갈 뿐이다. 하지만 이런 행보는 또한 사유의 진정한 운동에서 가장 멀리 벗어나게 되고, 그 진정한 운동을 최대한 변질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여기서 성립하는 것은 가설주의와 도덕주의이고, 이 둘은 서로 결부되어 있다. 이런 과학주의적 가설주의와 합리주의적 도덕주의를 통해 오인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 그것들이 접근하고 있는 사태 자체이다. p.431-432
우연 속에 자의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단지 우연이 긍정되지 않고, 그것도 충분히 긍정되지 않기 때문이며, 단지 우연을 추방할 목적으로 있는 규칙들을 통해 그 우연을 어떤 공간과 수안에서 할당하기 때문이다. 우연이 충분히 긍정된다면, 놀이 참여자는 결코 패할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조합, 그리고 그 조합을 산출하는 각각의 던지기[놀이]는 우발점의 움직이는 장소와 명령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번 모든 우연들을 단번에 긍정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긍정은 불균등한 것들의 공명에 의해 측정되며, 이 불균등한 것들은 어떤 한 번의 던지기에서 나오고 또 이 공명의 조건에서 어떤 문제를 형성한다. 그래서 각각의 던지기는 비록 부분적인 것일지언정, 거기에는 모든 우연들이 함께하고 있다. 도 산출된 조합이 비록 어떤 점진적 규정의 대상일지언정, 그 각각의 던지기 안에는 역시 모든 우연들이 단번에 함깨하고 있다. 주사위 놀이를 통해 펼쳐지는 것은 문제 계산법이다. 거기서는 어떤 구조를 구성하는 미분적 요소들의 규정이나 독특한 점들의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명법들과 그 명법들에서 비롯되는 문제들 사이에 순환적 관계가 형성된다, 공명은 하나의 문제가 문제로서 지니게 될 진리는 구성하고, 명법은 비록 그 스스로 문제 자체를 낳는다 해도 그 문제의 진리 안에서 검증된다. 우연이 긍정되면, 모든 자의성들은 매번 폐기된다. 우연이 긍정되면, 발산 그 자체는 한 문제 안에서 긍정의 대상이 된다. p.434-435
문제들의 심장부에는 어떤 자유로운 결정 능력이 있고, 우리를 신들의 종족으로 만들어주는 창조, 던지기가 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다. 신들 자체도 아낭케, 다시 말해서 하늘-우연에 종속되어 있다. 우리를 관통하는 명법이나 물음들은 '나'로부터 유래하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그 나는 이 명법이나 물음들을 듣는 것 조차 마다하고 있다. 명법들은 존재에서 온다. 모든 물음들은 존재론적이고, 문제들 안에서 '존재자'를 분배한다. 존재론, 그것은 주사위 놀이 -코스모스가 발생하는 카오스모스- 다. 만일 존재의 명법들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는다면, 그것은 균열된 나와 맺는 관계이고, 이 균열된 나의 틈바구니는 그 존재의 명법들을 통해 매번 시간의 순서에 따라 자리를 바꾸고 재구성된다. 따라서 명법들은 순수사유의 사유 대상들을 형성한다. 이것들은 사유의 미분들로서, 사유될 수 없는 동시에 사유되어야 하고, 도 오로지 초월적 실행의 관점에서만 사유될 수 있다. 또 물음들은 이런 사유 대상들에 대한 순수사유들이다. p.436
만일 '존재자'가 우선 차이이자 시작이라면, 존재 그 자체는 반복이자 존재자의 새로운 시작이다. 반복, 그것은 어떤 조건의 '수임자', 곧 존재의 명법들에 대한 인증 조건을 책임지는 수임자이다. 기원의 개념이 지닌 모호성은 언제나 여기에 있고, 위에서 언급된 우리의 실망도 여기서 비롯되고 있다. 즉 기원은 오로지 모사는 물론이고 최초의 원본도 부인되는 세계 안에서만 설정될 수 있다. 기원은 오로지 이미 보편적인 근거와해 안으로 빠져 든 세계 안에서만 어떤 근거를 설정할 수 있다. p.442
문제가 가설로 번역되는 순간, 각각의 가설적 긍정은 어떤 부정과 겹쳐 있게 되고, 이제 이 부정이 대리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그림자에게 배반당한 그 문제의 상태이다. 자연은 문제를 통해 진행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 안에는 가설이 없다. 하물며 부정적인 것의 이념이란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이 논리적 제한으로 이해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실재적 대립으로 이해되어야 하는지의 여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p.443
부정적인 것에 대한 비판이 효력을 얻으려면 반드시 대립과 제한의 무차별성을 폭로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 가설적인 개념적 요소까지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바로 그 요소를 통해 대립과 제한 가운데 하나가 필연적으로 보존되고, 심지어 하나가 다른 하나 속에 보존되는 일도 일어나기 때문이다. 요컨대 부정적인 것에 대한 비판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 출발점을 이념에 두어야 한다. 이념적이고 미분적이며 문제제기적인 그 요소가 그 비판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양체라는 기초개념은 일자와 다자, 다자에 의한 일자의 제한, 그리고 일자와 다자의 대립 등의 한계를 동시에 모두 드러낸다. 변이성은 질서와 무질서의 한계를 동시에 드러낸다. (비)-존재, ?-존재는 존재와 비-존재를 동시에 고발한다. 도처에서 부정적인 것과 가설적인 것이 맺고 있는 공모의 매듭을 모두 풀어내야 하고, 보다 심층적인 곳에서 차이와 문제제기적인 것을 묶고 있는 끈을 드러내야 한다. 사실 이념은 미분적 요소들 간의 상호적 관계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 요소들은 이 관계들 안에서 완결된 형태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 비율적 관계들은 결코 어떠한 부정적인 항도, 결코 어떠한 부정성의 결합관계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념을 특징짓는 섬세한 미분적 메커니즘들 -그 가벼움- 에 비할 때, 개념 안의 대립, 갈들, 모순들 등은 얼마나 조잡해 보이는가. 그 무게는 너무 무겁고 그 치수는 근사의 크기이되 너무 힘겹고 우둔하게 보인다. 우리는 실증성이라는 이름을 오직 다양성을 띤 이 이념의 지위를 지칭하거나 그 문제제기적인 것의 견고성을 지칭하기 위해서만 따로 사용해야 한다. 전적으로 실증적인 이 (비)-존재는 어떤 부정적인 비-존재로 기울고 또 자기 자신의 그림자와 혼동되는 경향에 놓이며, 게다가 의식의 가상을 틈타 극심한 변질을 겪게 된다. 우리는 매 순간 이런 타락의 과정을 감시해야 한다. p.444-445
잠재적인 것에 대해 현실화된다는 것은 그것의 본성상 분화된다는 것이다. 각각의 분화는 어떤 국소적 적분, 어떤 국소적 해결이다. 이 국소적 해결은 총체적 해결이나 총괄적 적분 안에서 다른 국소적 해결들과 함께 합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체 안에서 현실화의 절차는 부분들의 국소적 분화로 드러나는 동시에 내부적 환경의 전반적 형성으로 나타나고, 또 유기체가 구성되는 장 안에서 제기되 어떤 문제의 해결로 나타난다. 유기체는 어떤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유기체의 분화된 기관들 각각도 마찬가지다. 가령 눈은 빛이 제기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유기체 안의 그 어떤 것, 그 어떤 기관도 내부적 환경이 없다면 분화될 수 없다. 규제 혹은 조절을 가져오는 어떤 일반적 효력이나 통합능력을 갖춘 내부적 환경이 있고서야 비로소 분화될 수 있는 것이다. p.460
<창조적 진화>와 <물질과 기억>을 하나로 묶는 베르그손의 도식은 어떤 거대한 기억을 설명하면서 시작한다. 그 기억은 "원뿔"의 모든 절단면들이 잠재적으로 공존하면서 형성하는 어떤 다양체이다. 이 원뿔에서 각각의 절단면은 다른 모든 절단면들의 반복에 해당하고, 또 오로지 비율적 관계들의 질서와 특이점들의 분배에 의해서만 다른 모든 절단면들과 구별된다. 그래서 이 잠재적 기억의 현실화는 발산하는 선들의 창조로 나타난다. 이때 각각의 발산하는 선은 어떤 한 잠재적 절단면에 상응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식을 대변한다. 하지만 이는 그 선이 해당 절단면에 고유한 비율적 관계들의 질서와 독특성들의 분배를 어떤 분화된 종과 부분들 안에서 구현하기 때문이다. 잠재적인 것 안의 차이와 반복은 현실화의 운동, 창조로서의 분화의 운동을 근거짓고 마침내 가능한 것의 동일성과 유사성을 대체한다. 오로지 사이비 운동, 추상적 제한이라는 실재화의 거짓 운동만을 불러일으킬 뿐인 그 동일성과 유사성을 배제하는 것이다. p.462-463
명석-혼잡에 대응하는 이 애매-판명이란 무엇인가? 이쯤에서 부서지는 파도 소리를 사례로 끌어들이는 라이프니츠의 그 유명한 문헌으로 돌아가보자. 여기서도 여전히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먼저 우리는 파도 소리 전체의 통각이 명석하되 혼잡하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이 통각을 구성하는 미세 지각들은 그 자체로 명석하지 않고 애매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우리는 미세 지각들이 그 자체로 판명하고 애매하다고 말한다. 즉 미분비와 독특성들을 파악하기 때문에 판명하고, 아직 '구별되지' 않았고 아직 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애매하다. 그리고 스스로 응축되고 있는 이 독특성들은 우리의 신체와 어떤 비율적 관계에 놓이면서 어떤 의식의 문턱을 규정하고, 그것이 분화의 문턱에 해당한다. 미세 지각들은 이 의식의 문턱을 출발점으로, 하지만 어떤 통각 안에서 현실화된다. 이때 이 통각은 다만 명석한 동시에 혼잡할 뿐이다. 그 통각은 구별 혹은 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명석하고, 명석하기 때문에 혼잡하다. 그래서 문제는 더 이상 부분들과 전체의 관계를 중심으로(어떤 논리적 가능성의 관점에서) 제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잠재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의 관계(미분비들의 현실화, 특이점들의 구현)를 중심으로 제기된다. 바로 여기서 공통감 안의 재현이 지닌 가치는 역설감 안에서 환원불가능한 두 가치로 쪼개진다. 먼저 하나는 애매할 수밖에 없는 판명인데, 이는 판명할수록 애매해지는 가치이다. 다른 한편 혼잡할 수밖에 없는 명석-혼잡이 있다. 판명하면서 애매하다는 것은 이념의 본성에 속한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념은 현실적이지 않지만 실재적이고, 분화되어 있지 않지만 미분화되어 있으며, 전체적이지 않지만 완결되어 있다. 판명-애매는 고유한 의미의 철학적 도취, 현기증, 혹은 디오니소스적 이념이다. 그러므로 라이프니츠는 바닷가나 물레방아 근처에서 아주 간발의 차이로 디오니소스를 놓친 것이다. 그리고 디오니소스의 이념들을 사유하기 위해서는 아마 명석-혼잡의 사유자, 아폴론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 둘이 하나가 되어 어떤 자연의 빛은 재구성하는 일은 결코 없다. 그들이 같이 조성해내는 것은 오히려 철학적 언어 안의 두 암호문이고, 이는 인식능력들의 발산적 사용을 기다리고 있다. 문체상의 불균등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p.465-466
먼저 바에르가 말하는 최고의 일반성들은 단지 외부에서 바라보는 어떤 성숙한 관찰자에 대한 일반성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그 일반성들은 개체화의 장 안에 있는 개체-배를 통해 체험된다. 게다가 바에르의 제자 비알르통이 주목했던 것처럼 일반성들은 단지 개체-배를 통해서만 체험되고, 또 개체-배를 통해서만 체험 가능하다. 오로지 배만이 행할 수 있는 어떤 '사태들'이 있고, 오로지 배만이 꾀할 수 있거나 차라리 버텨낼 수 있는 어떤 운동들이 있다.(가령 거북의 경우 앞다리는 180도의 상대적 자리 이동을 겪거나 목은 가변적인 숫자의 최초 척추골들이 앞쪽으로 미끄러져 나가야 생긴다.) 배의 쾌거들과 운명, 그것은 그야말로 살아낼 수 없는 것을 살아내는 데 있고, 또 골격을 모두 부러뜨리거나 인대들을 파열시킬지도 모르는 대규모의 강요된 운동들을 살아내는 데 있다. 분화가 점진적이고 누진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과연 사실이다. 즉 종별화의 질서 안에 놓인 유와 종의 특성들에 앞서 커다란 유형들의 특성들이 먼저 나타난다. 또 유기적 조직화의 순서를 보면, 먼저 나타나는 발아체는 가령 오른발이나 왼발이 되기 이전의 발이다. 그러나 이런 운동이 가리키는 것은 어떤 일반성의 차이가 아니라 오히려 어떤 본성상의 차이다. 가장 낮은 단계의 일반성 아래에서 가장 높은 단계의 일반성이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형태론적, 조직학적, 해부학적, 생리학적 등등의 특성들 -이미 구성된 질과 부분들에 관련된 특성들- 아래에서 어떤 순수한 시공간적 역동성들(배의 체험 대상)이 발견된다. 이행은 최고 위치의 일반적인 것에서 최저 위치의 일반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잠재적인 것에서 현실적인 것으로 나아가고, 이런 이행은 점진적 규정에 의거해서, 또 현실화의 첫 번째 요인들에 따라 이루어진다. 여기서 '일반성'의 개념은 어떤 혼동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다. 창조에 의해 현실화되는 잠재적인 것과 제한에 의해 실재화되는 가능한 것이 서로 혼동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질과 부분들의 일반적 지지대에 해당하는 배가 있다면, 그 이전에 개체적 주체에 해당하고 또 시공간적 역동성들을 겪어내는 배가 먼저 있다. 애벌레-주체가 먼저 있는 것이다. p.467-468
이원성은 현실화 과정 자체 안에서는 현존하지 않는다. 다만 현실화 과정의 막바지에, 현실적 항들에 해당하는 종과 부분들에만 현존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직 어떤 실재적 구별이 아니고 오히려 어떤 엄격한 상보성이다. 왜냐하면 부분들이 종의 수를 가리키는 것처럼, 종들은 부분들의 질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부분들이 질의 공간을 작게 나누어놓는 반면, 종은 정확하게 질(사자됨, 개구리됨) 안에서 역동성의 시간을 맞아들인다. 질은 언제나 어떤 공간 안에서 번득이고, 이 공간의 시간 전체에 걸쳐 지속한다. 요컨대 드라마를 연출하는 극화는 분화의 분화, 질적인 동시에 양적인 분화이다. 그러나 여기서 동시에는 분화 그 자체가 종과 부분들, 종별화와 부분화라는 상관적인 두 길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차이나는 것을 그러모으는 차이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분화되는 것을 통합하고 접합하는 분화의 분화가 있다. 이는 드라마를 연출하는 극화의 필연적인 결과이다. 왜냐하면 극화는 이념의 두 특징인 미분비들과 그에 상응하는 독특한 점들을 서로 분리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한번에 구현하기 때문이고, 이 과정을 통해 미분비들은 종들 안에서, 독특한 점들은 부분들 안에서 현실화되기 때문이다.
이런 시공간적 역동성을 띤 규정들은 이미 칸트가 도식들이라 불렀던 것은 아닐까? 그렇지만 이 둘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도식은 분명 시간 규정의 규칙이자 공간 구성의 규칙이다. 하지만 도식은 논리적 가능성에 해당하는 개념과의 관계에서 사유되고 또 운용된다. 이런 참조 관계는 도식의 본성 그 자체에 현존하는 것이지만, 도식은 기껏해야 논리적 가능성을 초월론적 가능성으로 전환시키는 데 그친다. 도식을 통해 시공간적 결합관계들이 개념의 논리적 결합관계들에 상응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도식은 개념에 외부적이므로 어떻게 그것이 지성과 감성의 조화를 보장할 수 있는 지는 도대체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왜냐하면 도식 그 자체는 자기 자신과 지성적 개념의 조화를 보장해줄 그 무엇을 결여하고 있고, 다만 어떤 기적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도식의 위력은 대단하다. 바로 이 도식을 통해 개념은 비로소 어떤 유형학에 따라 나뉘고 종별화될 수 있다. 개념은 그 자신에 의해서는 결코 종별화되거나 분할될 수 없다. 개념 밑에서 어떤 숨겨진 기술처럼, 분화의 작인처럼 활동하는 것은 바로 시공간적 역동성들이다. 만일 이 역동성들이 없다면,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의 나눔ㅢ 방법에 반대하여 제기했던 물음들을 넘어선다는 것은나언제나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게다가 반쪽들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도식이 계산에서 빼놓고 있는 것은 딱 하나인데, 그것은 역량이다. 도식은 그 역량과 더불어 활동하지만, 바로 그 역량을 셈하지 않고 있다. 역동성들이 설정될 때, 그것도 개념의 도식들이 아니라 이념들의 드라마들로서 제기될 때는 모든 것이 바뀌게 된다. 사실 역동성은 개념에 외부적이고 그런 자격에서는 도식이지만, 이념에는 내부적이고 그런 자격에서는 드라마 혹은 꿈이기 때문이다. 종은 계통들로 나뉘고, 린네의 풀은 조르당의 풀들로, 개념은 유형들로 나뉜다. 하지만 이런 분할은 분할되는 것과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고, 분할되는 것과 동질적이지 않으며, 개념에 외부적이지만 분할 그 자체를 주재하는 이념들에는 내부적인 어떤 영역 안에서 확립된다. 그래서 역동성은 공간과 시간을 규정하는 자신의 고유의 역량을 포괄하고 있다. 왜냐하면 미분비들, 독특성들, 그리고 이념에 내재하는 점진성들을 직접적으로 구현하기 때문이다. 가장 짧다는 것은 단순히 직선 개념의 도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직선과 곡선의 분화를 표현하는 한에서 또한 선의 이념의 꿈, 드라마이거나 그 이념의 극화이다. 우리는 이념, 개념, 드라마를 서로 구별한다. 즉 드라마의 역할은 이념의 미분비와 독특성들을 구현하면서 개념을 종별화하거나 특수화하는 데 있다. p.472-475
잔혹극에 대해 말할 때 아르토는 그것을 단지 어떤 극단적 "결정론"으로 정의했을 뿐이다. 그것은 자연이나 정신의 이념을 구현하는 시공간적 규정의 결정론이고, 그렇게 구현될 대 이념은 어떤 "동요하는 공간"이 된다. 이념은 회전하고 상처를 유발하는 중력 운동, 유기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력 운동이 되고 저자도, 배우들도, 주체들도 없는 순수한 장면화가 된다. 공간들이 움푹움푹 패이고 시간들이 가속화되거나 감속화된다면 이는 몸 전체를 운동에 빠뜨리고 위태롭게 하는 어떤 비틀림과 전치들을 대가로 해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빛나는 점들은 우리를 관통하고, 독특성들은 우리를 곤두세운다. 도처에 있는 것이 거북의 모가지이고 최초 척추골들의 현기증 나는 미끄러짐이다. 심지어 하늘조차 '배우-태양들'처럼 자신의 살갗에 어떤 이념을 새겨 넣는 방위기점과 성좌들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 따라서 어떤 배우와 주체들은 확실히 있지만, 그것은 애벌레들이다. 왜냐하면 오로지 애벌레들만이 운동의 궤적, 미끄러짐, 회전들을 견뎌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이후에는 너무 늦어버리게 된다. 또한 모든 이념을 통해 자아의 유사성은 물론 나의 동일성도 깨져버리고, 그런 와중에서 우리는 애벌레들이 된다는 것도 진정 사실이다. 이 점은 퇴행, 고착, 혹은 발달 정지 등이 언급될 때 제대로 표현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상태나 순간에 고착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떤 시선의 섬광에 의한 것인 양 이념에 의해 고착되고, 언제나 진행 중에 있는 어떤 운동 속에서 고착되기 때문이다. 만일 빌리에 드 릴라당이 말하는 바의 고착적이고 장혹한 이념이 아니라면 그런 이념도 이념이라 할 수 있을까? 이념과 관계하는 한에서 그 누구도 수동적 위치의 인내자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것은 보통의 인내나 고착이 아니다. 고착된 것은 전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이미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우리가 배아들로 남아 있거나 다시 배아들이 될 때, 모든 퇴행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것은 차라리 반복의 순수한 운동이다. 우리가 개념의 재현들에 머물러 있을 때, 애벌레들은 자신의 살갗 속에 이념들을 품고ㅗ 있다. 애벌레들은 잠재적인 것에 전적으로 이웃해 있고 자신의 선택을 통해 그 잠재적인 것을 최초로 현실화시키지만, 가능한 것의 영역에 대해서는 도대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바로 여기에 거머리와 '우월한 인간'의 내적 친밀성이 있다. 그들은 꿈인 동시에 과학이고, 꿈의 대상인 동시에 과학의 대상이며, 물어뜯기인 동시에 인식이고, 입인 동시에 뇌이다. p.475-477
양식은 차이들의 소멸이나 부분들 간의 상쇄를 초래할 어떤 중간으로 차이를 끌어들인다. 양식은 그 자체가 '중간'이다. 극단들 사이에서 생각하면서 양식은 그 극단들을 추방하고 그 간격을 메워버린다. 양식은 차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이다. 양식은 차이들이 연장의 조건들과 시간의 질서 안에서 자신들끼리 서로 부정하게끔 만들어놓는다. 양식은 중간항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면서 플라톤의 데미우르고스처럼, 동등하지 않은 것을 쉬지 않고 끈덕지게 분할 가능한 것 안으로 몰아낸다. 양식은 추상적 생산물인 동등성 속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재발견하는 중간계급들의 이데올로기이다. 양식은 행동하기를 꿈꾼다기보다 자연적 중용의 구성을 꿈꾼다. 가장 높은 분화의 단계에서 가장 낮은 분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어떤 행동의 요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p.477-478
철학은 양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역설을 통해 드러난다. 역설은 철학의 파토스, 또는 정념이다. 게다가 역설은 여러 종류이고, 각기 정통 교리의 상보적인 형식들, 양식과 공통감에 대립한다. 주관적으로 역설은 인식능력들의 공통적인 사용을 깨뜨리고, 또 그런 역설을 통해 각각의 능력은 자신의 고유한 한계, 자신의 비교 불가능자에 직면하게 된다. 사유는 오로지 자신만이 사유할 수 있으면서도 결국 사유할 수 없는 어떤 것에 직면한다. 기억은 자신의 태고이기도 한 망각에 직면하고, 감성은 자신의 강도와 구별되지 않는 감각 불가능자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역설은 이 깨진 인식능력들을 향해 양식에는 속하지 않는 관계를 전달한다. 이때 인식능력들은 화산같이 폭발하는 선 위에 놓여서 한 능력의 불똥에서 또 다른 능력이 불길을 내뿜게 되고, 한 능력의 한계에서 또 다른 능력의 한계로 이어지는 어떤 도약이 일어난다. 다른 한편 역설을 통해 객관적으로 부각되는 것은 공통성을 띤 어떤 전체 속으로 총체화되지 않는 요소이고, 또 어떤 양식의 방향 안에서 동등화되거나 소멸되지 않는 차이다. 역설들에 대한 유일한 논박은 양식과 공통감 자체 안에 있다는 말이 있지만, 이는 오로지 어떤 조건에서만 지당한 말이다. 그것은 양식과 공통감이 이미 소송 당사자의 역할과 더불어 재판관의 역할은, 게다가 부분적 진리와 더불어 절대자를 모두 떠맡고 있다는 조건에서만 옳다. p.493
깊이는 바깥으로부터 길이와 넓이에 덧붙여지는 것이 아니다. 깊이는 다만 그 길이와 넓이를 창조하는 분쟁의 숭고한 원리로 깊이 은거하고 있을 뿐이다. p.498
사실 어떤 유형의 수가 자신의 본질 안에 어떤 비동등성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이 열어놓은 새로운 질서 안에서 그 비동등성을 추방하거나 소멸시켜야 한다. 가령 분수는 자신을 특징짓는 비동등성을 공약수의 동등성을 통해 상쇄한다. 무리수에서는 비동등성이 순수하게 기하학적인 비율적 동등성에 종속되고, 나아가 산술적으로는 어떤 수렴하는 유리수 계열에 의해 표시되는 어떤 극한의 동등성에 종속된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거듭 발견하는 것은 단지 밖-주름운동과 안으로 접힌 주름, 연장과 강도적인 것의 이원성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만일 수가 자신의 차이를 폐기한다면, 오로지 자신이 열어놓은 외연 안에서 그 차이의 주름을 펼치면서 폐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는 그 차이를 자기 자신 안에 보존한다. 자기 자신을 근거짓는 질서, 자신 안으로 함축된 질서 안에서 그 차이를 보존하는 것이다. 모든 수는 본질적으로 말소 불가능한 어떤 양적 차이를 함축하고, 그런 한에서 원천적으로 강도적이고 벡터적이다. 하지만 또한 모든 수는 자신이 창조학 그 안에서 자신의 주름을 펼치는 또 다른 평면 위에서는 이 차이를 소멸시키고, 그런 한에서는 외연적이고 스칼라적이다. 심지어 가장 단순한 유형의 수를 통해서도 이런 이원성을 확인할 수 있다. 가령 자연수는 원래 서수적이고, 다시 말해서 원천적으로 강도적이다. 기수는 이런 자연수의 결과이고, 서수가 펼친 밖-주름으로 현전한다. 종종 제기되는 반론에 따르면, 서수화는 이미 수집의 성격을 띠는 어떤 기수적 연산들을 함축하고, 따라서 수의 기원에 놓일 수 없다. 하지만 이는 "기수적인 것이 서수적인 것의 결과"라는 말을 잘못 이해해서 나오는 반론이다. 서수화는 결코 어떤 똑같은 단위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서수에 이를 때마다 스스로 '기수화'될 단위- 의 반복을 가정하지 않는다. 서수적 구성은 똑같은 것으로 가정된 어떤 단위를 함축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보게될 것처럼, 다만 어떤 환원 불가능한 거리 개념을 함축하고 있을 분이다. 여기에 함축된 것은 강도적 공-간의 깊이 안에 함축된 거리들이다. 서수화는 동일성을 띤 단위를 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거꾸로 그 동일한 단위는 기수에 속하고, 기수 안에서 어떤 외연적 동등성을, 외면화된 항들의 어떤 상대적 등가성을 가정한다. 그러므로 기수가 분석적으로 서수에서 따라 나오는 결과라거나 어떤 서수적인 유한 수열의 각 끝항에서 따라나오는 결과라는 믿음을 경계해야 한다. 사실 서수적인 것은 오로지 외연을 통해서만 기수적인 것이 된다. 다시 말해서 공-간 안에 봉인된 거리들이 자연수가 열어놓은 어떤 연장 안에서 주름을 펼치거나 자신을 개봉해가고, 그런 가운데 서로 동등해지는 한에서만 서수적인 것은 기수적인 것으로 바뀐다. 말하자면 수의 개념은 처음부터 종합적인 것이다. p.503-504
우리가 강도 안에서 차이라 부르는 것은 실재적으로 함축되거나 봉인되는 것에 해당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강도는 외연량과 같이 분할 가능한 것도, 질처럼 분할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외연량들의 분할 가능성은 세 단계로 정의된다. 먼저 외연량들은 어떤 단위의 상대적 규정을 통해 정의된다.(이때 이 단위는 그 자체로는 분할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다만 그 분할이 멈추어야 할 수준을 표시하고 있을 따름이다.) 다른 한편 외연량들은 단위에 의해 규정된 부분들의 등가성을 통해 정의된다. 마지막으로 외연량들은 이 부분들과 분할되는 전체의 동-실체성을 통해 정의된다. 그러므로 분할이 이루어지고 계속된다 해도 분할되는 것의 본성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반면 어떤 온도가 다수의 온도들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속도가 다수의 속도들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할 때, 각각의 온도는 이미 차이고, 차이들은 어떤 똑같은 질서의 차이들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질적인 항들로 이루어진 어떤 계열들을 함축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로스니가 지적한 바와 같이, 어떤 동질적 양이라는 허구는 강도 안에서는 사라진다. 강도량은 분할되지만, 본성을 바꾸지 않고서는 분할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강도량은 분할 불가능하지만, 이는 어떠한 부분도 분할에 선재하지 않고, 또 분할되면서 똑같은 본성을 유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p.513-514
따라서 외연량들과는 거꾸로 강도량들은 봉인하는 차이 -봉인된 거리들- 에 의해, 그리고 즉자적 비동등 -본성적 변화의 질료에 해당하는 어떤 자연적 '잔여'를 증언하는 비동등- 에 의해 정의된다. 거리와 길이들이 각기 서로 다른 다양체들을 가리키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유형의 다양체들을 구별해야 한다. 즉 함축적인[안-주름진] 다양체들과 명시적인 [밖-주름진] 다양체들을 구별해야 하고, 분할이 진행됨에 따라 측정 단위가 변하는 다양체들과 측정 단위의 불변 원칙을 동반하는 다양체들을 구별해야 한다. 차이, 거리, 비동등성 등과 같은 것들은 강도적 공-간에 해당하는 깊이의 실증적 특성들이다. 그리고 밖-주름운동을 통해 차이는 스스로 소멸되는 경향을 띠게 되지만, 또한 이 운동을 통해 거리들은 길이들로 확장, 개봉되는 경향을 띠게 되고, 분할 가능한 것은 동등화의 경향을 띠게 된다. (여기서 다시 한번 분할 가능한 것은 오직 비동등한 것을 포괄할 때만 어떤 즉자적 본성을 형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파했던 플라톤의 위대함이 드러난다.) p.514-515
차이는 오로지 자신이 외연 안에서 스스로 소멸되는 과정 안에서만 질적인 것이 된다. 그 본성 자체 안에서 보면, 차이는 외연적인 것도, 질적인 것도 아니다. 우선 질들은 종종 언급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안정성, 부동성, 일반성 등을 지닌다는 점에 주목하자. 이것들은 어떤 유사성들의 질서들이다. 질들이 서로 다르고 본성상의 차이를 지닌다는 것, 이는 확실한 사실이지만 언제나 어떤 가정된 유사성의 질서 안에서 성립하는 사실에 불과하다. p.516
차이는 오로지 자신이 밖-주름운동에 놓이는 연장 안에서만 정도상의 차이다. 차이는 오로지 이런 연장 안에서 자신을 뒤덮는 질 아래에서만 본성상의 차이다. 차이의 모든 등급이나 정도들은 이 둘 사이에 있고, 그 둘 아래에는 차이의 본성 전체가 있으며, 그 본성은 강도적인 것이라는 데 있다. 정도상의 차이들은 다만 가장 낮은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고, 본성상의 차이는 다만 가장 높은 본성의 차이일 뿐이다. 본성상의 차이와 전도상의 차이가 서로 갈라놓거나 분화시키는 것, 그것은 차이의 정도나 본성에 대해서는 똑같은 사태이지만, 그 같음은 차이나는 것을 통해 언명되는 같음이다. 또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베르그손이 도달한 극단적 결론에 따르면, 차이의 본성과 정도들은 서로 동일한 사태이고, 여기서 성립하는 이 '같음'이야말로 아마 반복(존재론적 반복)일 것이다...... p.518-519
되돌아오지 않는 것, 그것은 오로지 '결정적인 어떤 한 순간 모두'의 법칙 아래에서만 나타나는 모든 것이다. 반복도 어떤 똑같은 질, 똑같은 연장적 물체, 똑같은 자아 (따라서 부활).... 등의 동일성 조건에 종속될 때 그런 모든 것에 포함된다. 이는 과연 질도 연장도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일까?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두 가지 상태의 질을 구별해야 하는 것처럼 두 가지 상태의 외연을 구별해야 하는 지점에 이른 것이 아닐까? 첫 번째 상태에서 질은 어떤 강도의 차이가 만드는 거리나 간격 안에서 섬광을 발하는 어떤 기호이다. 두 번째 상태에서 질은 어떤 효과이고, 이미 자신의 원인에 반작용을 미치고 있으며 차이를 소멸시키는 경향을 지닌다. p.526
강도량들의 윤리학은 단지 두 가지 원리만을 지닌다. 가장 낮은 것까지 긍정하기, 자기 자신을 (너무) 설명하지 않기, 다시 말해서 자신의 주름을 (너무) 바깥으로 펼치지 않기가 그것이다. p.526-527
다윈에게서 개체적 차이는 그 자체로는 도태나 분화의 일차적 질료로 사유되고 있지만, 아직은 어떤 명확한 지위를 지니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즉 자유롭고 유동적이고 묶여 있지 않은 이 개체적 차이는 어떤 규정되지 않은 변이 가능성과 혼동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스만은 개체적 차이를 낳는 어떤 자연적 원인이 유성생식에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다윈주의에 매우 중요한 공헌을 가져오게 된다. 이때 유성생식은 '변이된 개체적 차이들의 끊임없는 생산'의 원리에 해당한다. 성적 분화 자체가 유성생식에서 비롯되는 결과인 한에서, 우리는 종들의 분화, 유기체적 부분들의 분화, 성들의 분화 등 세 가지 커다란 생물학적 분화가 개체적 차이를 중심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지, 결코 그 반대가 아님을 알게 된다. 이것이 다윈주의가 일으킨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의 세 가지 형태이다. 첫 번째 형태는 개체적 차이들의 분화와 관련되고, 이 분화는 특성들의 분기와 군들의 규정에 해당한다. 두 번째 형태는 차이들의 묶기와 관련되고, 이는 어떤 같은 군 안에서 이루어지는 특성들의 상호 조정에 해당한다. 세 번째 형태는 차이들의 생산과 관련되고, 이 생산은 분화와 묶기의 연속적 질료에 해당한다. p.535-536
생식의 모든 양태들은 어떤 유기체적 '탈분화' 현상들을 함축한다. 수정란은 오로지 유기체의 부분들에 의존하지 않는 어떤 장 속에서 발달한다는 조건에서만 그 부분들을 재구성할 수 있다. 또 수정란은 오로지 어떤 종적 탈분화 현상들을 드러낸다는 조건에서만 종의 한계들 안에서 발달할 수 있다. 오로지 같은 종에 속하는 존재자다르만이 실질적으로 종을 뒤어넘을 수 있고, 나아가 잠정적으로 종을 초과하는 특성들로 복귀한 존재자, 그래서 어떤 원기들로 기능하는 존재자들을 생산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폰 바에르의 발견이다. 그의 지적에 따르면, 배아는 다른 종들에 속하는 어떤 조상 격 성체의 형상들을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다. 배아가 체험하고 감내하는 상태들, 배아가 시도하는 운동들은 어떤 특정 종의 수준에서는 살아낼 수 없는 것들이다. 그것들은 종, 속, 과, 목의 한계들을 넘어서고, 또 오로지 배아만이 배아적 삶의 조건들 안에서 견뎌낼 수 있다. 이로부터 바에르는 후성설이 가장 높은 단계의 일반성에서 가장 낮은 단계의 일반성으로 나아가고,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유형들에서 속과 종의 규정들로 나아간다는 결론을 끌어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높은 일반성이란 것은 추상적 분류 개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그 일반성은 배아에 있는 그대로 체험되기 때문이다. 그 일반성의 배후에는 먼저 종들의 현실화에 선재하는 잠재성이 있고, 무엇보다 그 잠재성을 구성하는 미분비들이 있다. 다른 한편 그 일반성의 배후에는 이런 현실화의 일차적 운동들이 있고, 또 무엇보다 이 현실화의 조건이 있다. 다시 말해서 수정란 안에서 자신의 구성의 장을 발견하는 개체화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생명의 가장 높은 일반성들은 종과 속들을 넘어서지만, 어떤 추상적인 비인격성을 향해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개체와 전-개체적 독특성들을 향해 넘어서는 것이다. p.536-537
개체화하는 차이는 우선 개체화의 장 안에서 사유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때 이 개체화의 장은 나중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어떤 알 속에 있다. 차일드와 바이스의 연구 이래 하나의 수정란 안에는 어떤 대칭축이나 대칭면들이 있다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도 실증적인 것은 여전히 주어진 대칭적 요소들 안에 있다기보다 거기에 부재하고 거기에 주어져 있지 않은 것 안에 있다. 축들을 따라, 또 한 극에서 다른 한 극으로 향해 가면서 강도는 자신의 차이를 할당하고, 그런 가운데 원형질을 가로질러 확장되는 어떤 변이의 파동을 형성한다. 최대의 활동성을 띤 부위가 가장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고, 또 어떤 하위의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들의 발달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즉 알 속의 개체는 가장 높은 것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향하는 어떤 진정한 전락이다. 개체는 자신을 포괄하고 있는 강도의 차이들을 긍정하고, 그런 가운데 그 차이들 속으로 낙하해 들어간다. p.539
이념은 판명한 한에서 애매하다.(분화되지 않았고 다른 이념들과 공존하며 다른 이념들과 더불어 '막-주름져'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념들이 강도나 개체들에 의해 표현될 때 안-주름운동이라는 이 새로운 차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는 데 있다.
바로 여기서 강도, 바로 차이 그 자체는 어떤 미분비들과 그에 상응하는 특이점들을 표현한다. 강도는 이 비율적 관계들 안에, 그리고 이념들 사이에 새로운 유형의 구별을 끌어들인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념들, 비율적 관계들, 이 관계들의 변이들, 특이점들 등은 분리된다. 이것들은 함께 공존ㄴ하는 대신 어떤 동시성의 상태나 매 순간 계속 이어지는 상태들로 들어선다. 그렇지만 모든 강도들은 서로가 서로의 안으로 함축되고, 각각의 강도는 저마다 봉인하는가 하면 또 봉인된다. 그런 가닭에 각각의 강도는 끊임없이 이념들의 변화하는 총체, 미분비들의 가변적 전체를 표현한다. 하지만 강도가 명석하게 표현하는 것들은 오로지 특정한 미분비들이나 이 비율들의 특정한 변이 등급들 뿐이다. 강도가 명석하게 표현하는 것들은 정확히 그것이 봉인하는 기능 안에서 직접 겨냥하는 것들이다. 강도는 여전히 모든 비율적 관계, 모든 변이의 등급, 모든 점들을 표현하지만 단지 혼잡하게만 표현할 뿐이고, 자신의 봉인되는 기능 안에서 표현할 뿐이다. 이 두 가지 기능은 상호적으로 주고받는 관계에 있고 강도는 무엇보다 먼저 자기 자신에 의해 봉인된다. 그러므로 판명과 애매가 이념 자체 안에서 분리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념을 표현하는 강도 안에서, 다시 말해서 이념을 사유하는 개체 안에서는 명석과 혼잡도 역시 더 이상 분리될 수 없는 논리적 특성이라 해야 한다. 이념의 통일성에 해당하는 판명-애매에는 개체화하는 강도적 통일성에 해당하는 명석-혼잡이 상응한다. 명석-혼잡의 특질이나 자격을 갖는 것은 이념이 아니라 오히려 이념을 사유하거나 표현하는 사유자이다. 사실 그 사유자는 개체 자신이기 때문이다. 판명한 것은 애매한 것에 다름 아니었고, 판명한 한에서 애매했다. 하지만 지금은 명석한 것은 혼잡한 것에 다름 아니고, 명석한 한에서 혼잡하다. 앞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인식의 논리의 관점에서 재현 이론의 결점은 명석과 판명 사이에 어떤 정비례 관계를 설정한 나머지 이 두 가지 논리적 가치를 묶어주는 반비례 관계를 무시했다는 데 있다. 모든 사유의 이미지는 이 점에서 훼손을 입었다. 오로지 라이프니츠만이 어던 논리적 사유의 조건들에 근접했고, 이는 정확히 그의 개체화 이론과 표현 이론에서 영감을 얻은 덕분이다. 사실 라이프니츠의 문헌들은 불명료하고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표현되는 것(미분비들의 연속체나 잠재적이고 무의식적인 이념)이 그 자체로 판명하고 애매하다는 것은 종종 확실한 듯하다. 가령 바닷물의 모든 물방울들은 미분비들, 그 비율적 관계들의 변이들, 이 관계들이 포괄하는 특이점들 등을 지닌 어떤 발생적 요소들에 해당한다. 또 표현하는 것(지각하고 상상하거나 사유하는 개체)은 본성상 명석하고 혼잡하다는 것도 확실한 것처럼 보인다. 가령 파도 소리에 대한 우리의 지각은 혼잡하게 전체를 포괄하지만, 그것이 명석하게 표현하는 것은 오로지 우리의 신체와 이 신체가 규정하는 어떤 의식의 문턱에 의존하는 특정한 비율적 관계들, 특정한 점들뿐이다. p.542-544
끝으로 어떤 똑같은 종에 속하는 개체들이 어떤 다른 종들에 참여함에 따라 서로 구별되는 것이라고도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는 마치 각각의 인간 안에 어떤 당나귀와 사자, 늑대나 양 등이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물론 그런 것들은 모두 있고, 또 윤회는 그 모든 상징적 진리를 간직하고 있다. 하지만 당나귀와 늑대는 오로지 그것들을 명석하게 표현하는 개체화의 장과 관련해서만 어떤 종들로 간주될 수 있다. 혼잡한 것 안에서, 그리고 봉인되는 것 안에서 당나귀와 늑대는 단지 어떤 가변적인 것들의 역할, 어떤 합성하는 영혼이나 개체적 차이들의 역할만을 담당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프니츠가 윤회의 개념을 "윤도"의 개념으로 대체한 것은 옳은 일이었다. 이를 통해 그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영혼은 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몸이 재-봉인되고 재-함축되었다가 필요에 따라 다른 개체화의 장들 안으로 들어간다는 점이고, 그런 가운데 "좀 더 미묘한 연극"으로 되돌아간다는 점이다. 모든 신체와 모든 사물은 사유한다. 하지만 자신의 강도적 이유들로 복귀하여 자신이 그 현실화를 규정하는 어떤 이념을 표현하는 한에서 사유하고, 또 그런 한에서만 자신이 어떤 하나의 사유이다. 하지만 사유자 그 자신은 모든 사물들을 자신의 개체적 차이들로 만든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사유자는 어떤 돌과 다이아몬드들, 어떤 식물과 '심지어 동물들'로 가득 차 있다. 사유자, 어쩌면 영원회귀의 사유자는 개체, 보편적 개체이다. 바로 이런 사유자는 명석한 것과 혼잡한 것, 명석-혼잡한 것의 모든 역량을 이용하여 이념을 사유하되, 그 이념이 판명-애매한 것으로서 지니는 모든 역량 안에서 사유한다. 또한 여기서 계속 상기해야 하는 것은 개체성이 지닌 다양체적이고 변동적이며 소통적인 특성, 즉 함축되는 특성이다. 개체의 개체성은 단지 본성상의 변화 없이는 분할되지 않는다는 강도량들의 속성에서 유래한다. 우리는 이 모든 깊이와 거리들로 이루어져 있고, 개봉되고 재-봉인되는 이 강도적 영혼들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개체화 요인들이라 부르는 것은 봉인하고 봉인되는 이 강도들 전체, 개체화하고 개체적인 이 차이들 전체이다. 이 차이들은 끊임없이 개체화의 장들을 가로질러 서로가 서로의 안으로 침투해 들어간다. 개체성은 통일된 자아의 특징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분열된 자아의 체계를 형성하고 또 양육한다.
심리적 체계들 안에서 타인이 지닌 본성과 기능
밖-주름운동 중에 있는 심리적 체계들 안에는 여전히 어떤 안-주름운동의 가치들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거기에는 개체화 요인들을 위해 증언하는 어떤 봉인의 중심들이 있어야 한다. 이 중심들은 분명 나에 의해서도, 자아에 의해서도 구성되지 않는다. 이 중심들은 오히려 나-자아 체계에 속하는 어떤 전적으로 다른 구조에 의해 구성된다. 이 구조는 타인autrui이라는 이름으로서 지칭되어야 한다. 이 구조는 그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다른 나에 대한 자아를, 자아에 대한 다른 나를 가리킬 따름이다. 기존 이론들의 오류는 정확히 타인이 대상의 신분으로 환원되는 한 극단과 타인이 주체의 신분으로 상승하는 다른 한 극단 사이에서 끊임없이 동요한다는 데 있다. 심지어 사르트르조차 이런 동요를 본연의 타인 안에 기입하는 데 만족한 나머지, 타인은 내가 주체일 때는 대상이 되고 또 내가 다시 대상이 되지 않고서는 주체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 그래서 타인의 구조는 오인을 면치 못했고, 타인이 심리적 체계들 안에서 떠맡는 기능 역시 오인의 상태에 머물렀다. 타인은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두 체계 안에서 성립하는- 타자에 대한 자아이자 자아에 대한 타자이다. 이런 타인은 어떤 선험적 타인이고, 이런 선험적 타인은 각 체계 안에서 자신의 표현적 가치, 다시 말해서 함축적이고 봉인하는 가치를 통해 정의된다. 가령 어떤 겁에 질린 얼굴을 (내가 이 공포의 원인을 알지도, 느끼지도 못한다는 어떤 경험의 조건들 안에서) 생각해보자. 이 얼굴은 어떤 가능한 세계 -겁을 주는 무서운 세계- 를 표현한다. 표현이란 말을 통해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언제나 표현하는 것과 표현되는 것 사이에서 성립하는 어떤 결합관계이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어떤 왜곡을 포함하는 관계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표현하는 것이 마치 전적으로 다른 어떤 것과 관계하는 양 표현되는 것과 관계함에도 불구하고, 표현되는 것은 표현하는 것의 바깥에서는 실존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능하다는 말을 통해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결코 어떤 유사성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함축되는 것의 신분, 봉인되는 것의 신분, 게다가 심지어 자신을 봉인하고 있는 것과도 이질적인 상황에서 봉인되는 것이 지니는 신분이다. 즉 겁에 질린 얼굴은 자신을 공포에 빠뜨리는 것과는 유사하지 않지만, 그것을 무서운 세계의 상태에서 봉인한다. 각각의 심리적 체계마다 실재의 주위에는 어떤 가능성들이 우글거리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가능자들은 언제나 다른 것들, 타자들이다. 타인은 자신을 구성하는 표현성과 분리될 수 없다. 심지어 타인의 신체를 어떤 대상으로, 그의 귀와 눈들을 어떤 해부학적 대상으로 주시할 때조차 우리는 거기서 모든 표현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 우리가 이것들이 표현하는 세계를 극단적으로 단순화시킨다 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즉 눈은 어떤 함축된 빛이다. 눈은 어떤 가능한 빛의 표현이고, 귀는 어떤 가능한 소리의 표현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것들은 그 실존양태가 무엇보다 먼저 타인에 의해 봉인되는 이른바 제3의 성질들이다. 반면 나와 자아를 특징짓는 것은 어던 개봉[전개]이나 밖-주름운동[설명]의 기능들이다. 즉 나와 자아는 질들 일반을 이미 자신들 체계의 연장 안에서 개봉된 것으로 체험할 뿐 아니라 타인에 의해 표현된 세계를 -그 세계에 참여하기 위해서든 그 세계를 부인하기 위해서든- 설명하고 전개하는 경향이 있다. 개봉 운동상의 이런 결합관계는 우리의 공동체뿐 아니라 우리와 타인의 분쟁까지도 형성하는 것이지만, 결국 타인의 구조를 깨뜨리고, 그래서 한 경우에는 타인을 대상의 신분으로 환원하는가 하면 다른 한 경우에는 타인을 주체의 신분으로 끌어올린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비록 인위적일지언정 어떤 특별한 경험 조건들을 요구할 권리가 있었다. 즉 표현되는 것이 그것을 표현하는 것의 바깥에서는 아직 (우리에 대해) 실존하지 않을 때, 타인은 어떤 가능한 세계의 표현에 해당한다.
따라서 어떤 나-자아의 심리적 체계 안에서 타인은 감싸기, 봉인, 안-주름운동의 중심으로 기능한다. 타인은 바로 개체화 요인들의 대리자이다. 그리고 하나의 유기체가 어떤 미시적 존재자로 간주될 수 있음이 사실이라면, 심리적 체계들 안의 타인은 더 말할 나위 없다. 심리적 체계들 안에서 타인은 엔트로피의 국소적 상승들을 형성하는 반면, 자아에 의한 타인의 설명은 법칙에 합치하는 어떤 점진적 감소를 나타낸다. 앞에서 언급된 "자신을 지나치게 설명하지 말라."는 규칙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보다 타인과 더불어 자신을 지나치게 설명하지 말라는 것, 자신의 함축적 가치들을 유지하라는 것, 표현들 바깥에서는 실존하지 않는 이 표현되는 것들이 모두 우리의 세계에 서식하도록 만들면서 이 세계를 증식시키라는 것 등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어떤 다른 나에 해당하는 것은 타인이 아니라 오히려 나, 어떤 타자, 어떤 균열된 나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언제나 어떤 본연의 가능한 세계, 자신을 표현하는 타인 속에 감싸여 있는 그런 가능한 세계를 현시하면서 시작된다. 알베르틴의 얼굴은 해변과 파도들의 혼합물을 표현하고 있었다. "그녀는 도대체 어떤 미지의 세계로부터 나를 구별하는 것일까?" 이 모범적인 사랑의 역사 전체는 알베르틴에 의해 표현되는 그 가능한 세계들을 펼쳐 내는 길고 긴 설명이고, 이 설명이라는 밖-주름운동을 통해 그녀는 때로는 매혹적인 주체로, 때로는 환멸의 대상으로 변형된다. 물론 타인은 자신이 표현하는 가능자들에게 어떤 실재성을 부여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고, 이점에 관한 한 타인은 우리가 그 가능자들로 하여금 겪어나가도록 만드는 개봉의 과정과는 독립적이다. 그 수단은 곧 언어이다. 타인에 의해 선택된 단어들은 있는 그대로의 가능자에 어떤 실재성의 지위를 부여한다. 따라서 거짓말을 정초하는 초석은 언어 자체 안에 기입되어 있다. 내적으로 공명하는 체계들 안에서 언어가 자신의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안-주름운동의 가치들이나 봉인의 중심들의 가치들에 의거하여 언어가 떠맡는 이런 역할에서 비롯된다. 타인의 구조와 그에 상응하는 언어의 기능이 실제적으로 재현하는 것은 본체의 발현, 표현적 가치들의 상승,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차이의 이런 내면화 경향이다. p.556-559
차이를 강도 안에서 복원하고 감성적인 것의 존재로 복원한다는 것은, 차이를 지각 안의 유사성에 종속시키고 오로지 동일한 개념의 소재로 주어진 잡다를 동질화시킨다는 조건에서만 느낄 수 있게 만드는 이 두번째 매듭을 푼다는 것과 같다. p.569
사실 -그리고 이것이 두 번째 문제점인데- 재현은 차이를 이해[포괄]하기 위해서는 물론이고 반복을 설명하기 위해서도 여전히 개념의 동일성을 끌어들인다. 차이는 동일성을 띤 개념 안에서 재현되고, 따라서 단순히 어떤 개념적인 차이로 환원된다. 반면 반복은 개념 바깥에서 어떤 개념 없는 차이로 재현되지만, 언제나 어떤 동일성을 띤 개념의 전제 아래에서 재현된다. 가령 어떤 사태들이 똑같은 개념에 속하면서 공간과 시간 안에서 수적으로 구별된다면, 거기에는 반복이 있는 셈이다. 다라서 바로 이와 똑같은 운동을 통해 재현 안의 개념적 동일성은 차이를 포괄하고 반복으로까지 확장된다. 세 번째 측면은 여기서 비롯된다. 즉 반복은 단지 부정적인 설명밖에 받아들일 수 없음이 분명해진다.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개념 없는 차이들의 가능성을 설명하는 데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 개념의 계기들 각각에 대한 어떤 논리적 제한, 다시 말해서 어떤 상대적 '봉쇄'를 통해 개념 없는 차이를 설명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사실 개념의 내포를 아무리 멀리까지 확장한다 해도, 그 개념에 상응할 수 있는 사태는 언제나 무한히 많다. 왜냐하면 모든 차이를 어떤 개념적 차이로 만들 수 있는 그 무한대의 내포에 도달한다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반복은 오로지 우리의 개념적 재현에 대한 어떤 상대적 제한에 의존해서만 설명된다. 또 ㅈ어확히 이런 관점에 설 때 우리는 단순한 유사성으로부터 반복을 구별해 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빼앗기게 된다. 반면 두 번째 경우로 개념에 대해 어떤 절대적인 자연적 봉쇄를 강요할 수 있는 실재적 대립을 통해 개념 없는 차이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강요는 권리상 필연적으로 유한한 어떤 내포를 개념에 지정할 때 이루어지고, 도 심지어 무한정하기까지 한 개념의 내포에 외부적인 어떤 질서를 정의할 때도 이루어지며, 무한한 개념의 주관적 동반자들(기억, 재인, 자기의식)에 대립하는 어떤 힘들을 개입시킬 때도 이루어진다. 앞에서 보았던 바와 같이, 이 세 경우는 각각 명목적 개념들, 자연의 개념들, 자유의 개념들 -단어들, 자연, 무의식- 안에서 해당 사례들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또 절대적인 자연족 봉쇄와 인위적이거나 논리적인 봉쇄의 구별에 힘입어 아마 이 모든 경우에서 반복과 단순한 유사성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물들은 절대적으로 똑같은 어떤 개념 아래에서 차이가 날 때 반복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런 구별뿐 아니라 반복 또한 전적으로 부정적인 방식으로 설명된다. 아무개(언어)는 반복한다. 왜냐하면 아무개(단어들)는 실재적이지 않기 때문이고, 명목적 정의 이외의 어떤 다른 정의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개(자연)는 반복한다. 왜냐하면 아무개(물질)는 내면성을 지니지 않기 때문이고, 부분 밖의 부분이기 때문이다. 아무개(무의식)는 반복한다. 왜냐하면 아무개(자아)는 억압하기 때문이고, 아무개(이드)는 재기억도, 재인도, 자기의식도 없기 때문이며, 극단적으로는 본능을 지니지 않기 때문이다- 이때 본능은 개념에 해당하는 종의 주관적 동반자이다. 요컨대 어던 것이 반복한다면, 이는 언제나 자신이 아닌 것에 의존하는 반복이고, 또 자신이 갖지 못한 것에 의존하는 반복이다. 어떤 것이 반복한다면, 이는 그것이 포괄[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반복이다. 키에르케고르가 말했던 것처럼, 이는 귀머거리의 반복이거나 차라리 귀머거리를 위한 반복이고, 단어들의 청각 장애, 자연의 청각 장애, 무의식의 청각 장애에서 비롯되는 반복이다. 반복을 보장하는 힘들, 다시 말해서 절대적으로 똑같은 하나의 개념에 대해 사태들의 다수성을 보장하는 힘들은 재현 안에서는 오로지 부정적으로만 규정될 수 있을 따름이다. 네 번재로, 이는 반복이 단지 어떤 한 개념의 절대적 동일성에 대한 관계를 통해 정의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동일성을 띤 그 개념을 그 자신이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재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여기서 판단의 유비에 상응하는 어떤 현상이 산출된다.
네 번째로, 이는 반복이 단지 어떤 한 개념의 절대적 동일성에 대한 관계를 통해 정의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동일성을 띤 그 개념을 그 자신이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재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여기서 판단의 유비에 상응하는 어떤 현상이 산출된다. 반복은 똑같은 개념 아래에서 본보기들을 다수화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반복을 통해 개념은 자기 자신의 바깥에 놓이고, 또 가능한 지금 여기의 많은 본보기들 안에서 실존하게 된다. 데모크리토스가 파르메니데스의 일자-존재를 원자들로 파편화했고 다수화했던 것처럼, 반복은 동일성 자체를 파편화한다. 또는 차라리 절대적으로 동일한 하나의 개념 아래에서 사물들이 다수화될 때, 이런 다수화의 귀결은 개념이 절대적으로 동일한 사물들로 나뉜다는 데 있다. 자기 자신의 바깥에 놓인 개념이나 무한하게 반복되는 요소의 이런 위상은 바로 물질을 통해 실현된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의 모델은 순수한 물질과 혼동되고, 이때 이 순수한 물질은 동일자의 파편화나 어떤 최소치의 반복에 해당한다. 따라서 재현의 관점에서 반복이 얻게 되는 어떤 일차적 의미는 어떤 물질적이고 헐벗은 반복, 같은 것의 반복이라는 데(또 더 이상 단지 똑같은 개념 아래의 반복만이 아니라는 데) 있다. 그 밖의 다른 모든 의미들은 이 외생적 모델에서 파생될 것이다. 말하자면 어떤 이형, 어떤 차이, 어떤 위장, 어떤 전치 등과 마주칠 대마다 우리는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반복이지만 단지 어떤 파생적인 방식과 '유비'에 의한 반복이라고 말할 것이다. (심지어 심리적 삶 안의 반복을 비범한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는 프로이트에게서조차 반복의 개념은 억압이론 안의 어떤 대립의 도식뿐 아니라 죽음 본능 이론 안의 어떤 물질적 모델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 외생적인 물질적 모델은 이미 전적으로 이루어진 반복을 수용함과 동시에 이런 반복을 외부로부터 응시하는 어떤 관객에게 제시한다. 이 모델은 물질과 죽음 안에서조차 반복이 조성되고 이루어지기 위해 먼저 있어야 하는 그 두께를 제거해버린다. 이로부터 오히려 거꾸로 위장과 전치를 반복의 구성 요소들로 재현하려는 시도가 비롯된다. 하지만 여기서는 반복을 유비 자체와 혼동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동일성은 이제 더 이상 요소의 동일성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구별되는 요소들 사이에서 성립하는 어떤 비율적 관계의 동일성이거나 비율적 관계들 사이에서 성립하는 어떤 비율적 관계의 동일성이며, 이는 전통적 의미와 합치하는 동일성이다. 방금 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반복의 일차적 의미는 물리학적 질료인 물질에 의해 주어지고, 그 밖의 다른 모든 의미들은 유비를 통해 언명된다. 이제 유비는 그 자체로 반복의 논리학적 질료이고, 또 반복에 어떤 분배적 의미를 가져다준다. 하지만 이는 언제나 어떤 사유된 동일성, 어떤 재현된 동등성에 대한 관계를 전제하고, 그런 까닭에 반복은 계속 어떤 반성의 개념으로 머물러 있게 된다. 반성의 개념인 한에서 반복은 항들의 분배와 전치, 요소의 운반 등을 보장하지만, 여전히 외부에서 바라보는 어떤 관객을 위한 재현 안에서만 보장할 뿐이다. p.576-579
사실 근거짓는다는 것은 언제나 휘게 한다는 것, 구부린다는 것, 재차 구부린다는 것 -계절, 해, 날들의 질서를 조직한다는 것- 이다. 지망의 대상(자질, 차이)은 원환 속에 놓이게 된다. 몇몇 원호들은 두드러지게 되고, 이는 질적인 생성 안에서 근거가 지극히 더한 것과 지극히 덜한 것의 두 극단 사이에 포괄된 어던 정지, 순간, 중단들을 조성하기 때문이다. 서로 경쟁하는 지망자들은 그 움직이는 원환의 주의에서 분배되고, 각각의 지망자는 자신의 삶의 공적에 상응하는 몫을 배당받는다. 즉 여기서 하나의 삶은 어떤 엄밀한 현재와 같은 것이 된다. 사실 그 삶은 이 현재를 통해 원환의 일정 부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이 일정 부분은 그 현재에 의해 '수축'되며, 또 이 현재는 이 부분으로부터 어떤 손실이나 이익- 이미지들의 위계질서 안에서 현재의 고유한 전진이나 후퇴에 따라 결정되는 더함과 덜함의 질서상의 어떤 손실이나 이익- 을 끌어낸다.(어떤 다른 현재, 다른 삶은 어떤 다른 부분을 수축한다.) 플라톤주의에서 원환적 순환과 몫들의 분배, 순환 주기와 윤회가 어떻게 근거의 시험이나 제비뽑기를 형성하고 있는지는 익히 알려져 있다. 하지만 헤겔에게서도 여전히 가능한 모든 시작, 모든 현재들은 어떤 원리가 이루어내는 유일하고 부단한 원환 안에서 할당되고 있으며, 이 원리는 근거짓는 역할을 떠맡을 뿐 아니라 그 시작과 현재들을 자신의 원주 위에 분배하고, 그런 가운데 그것들을 모두 자신의 중심 안에서 포괄한다. 또 라이프니츠에게서 공-가능성 자체는 어떤 수렴의 원환이고 모든 관점들, 세계를 구성하는 모든 현재들은 이 원환에서 분배되고 있다. 이런 세 번재 의미에서, 근거짓는다는 것은 현재를 재현한다는 것이며, 다시 말해서 현재가 (유한하거나 무한한) 재현 안에서 도래하고 지나가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래서 근거는 아득한 태고의 기억이나 순수 과거로 나타난다. 이런 과거는 결코 현재였던 적이 없는 과거, 따라서 현재를 지나가게 하는 과거이고, 모든 현재들은 이런 과거에 대한 관계 안에서 원환을 이루는 가운데 공존하게 된다.
근거에서 무-바탕으로
근거짓는다는 것은 언제나 재현을 근거짓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근거에 본질적인 애매성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근거는 자신이 (앞에서 말한 세 가지 의미에서) 근거짓는 재현에 의해 유인되는 반면, 또 이와 동시에 어떤 저편에 의해 갈망의 상태에 빠진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근거지어지는 것 안으로 추락하기도 하고 어떤 무-바탕 안으로 빠져 들기도 하면서 그 사이에서 동요하는 것이다. 앞에서 우리는 이 점을 근거-기억을 통해 살펴본 바 있다. 즉 근거-기억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어떤 사라진 현재로 재현되도록 만드는 경향이 있고, 또 자신이 원리의 자격에서 조직하는 원환 안으로 스스로 어떤 요소처럼 들어가려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근거의 가장 일반적인 특성은 그것이 스스로 조직하는 원환이 또한 철학적 '증명'의 악순환이 된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닐까? 이 악순환 속에서 재현은 자신을 증명해주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그래서 가령 칸트에게서 경험의 가능성은 자신의 고유한 증명에 대한 증명의 구실을 하고 있다. 반면 초월론적 기억은 자신의 현기증을 지배하고 순수 과거가 재현 안에서 지나가는 모든 현재로 환원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존해주지만, 결국은 이 순수 과거가 어떤 다른 측면에서 붕괴되는 것을 목격하게 되고, 또 차이와 반복이 재현을 통해 지나치게 단순하게 분배되고 있는 원환이 해체되는 것을 목격하기에 이른다. 그런 까닭에 시간의 두 번째 종합, 에로스와 므네모시네(기억내용을 찾아나서는 에로스와 순수 과거의 보물에 해당하는 므네모시네)를 통일하는 종합은,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어떤 세 번째 종합 안으로 이행하거나 그 안에서 전도된다. 이때 이 세 번째 종합을 통해서는 어떤 탈성화된 죽음본능과 본질적으로 기억상실증에 빠져 있는 어떤 나르키소스적 자아가 시간의 텅 빈 형식을 통해 현전하게 된다. 그런데 이와 다른 의미에서 새긴다 해도 근거는 과연 발산과 탈중심화의 역량, 허상 자체의 역량에서 오는 도전을 피할 수 있는 것일까? 이런 역량들을 통해 거짓된 원환과 거짓된 제비뽑기는 물론이고 거짓된 분배와 거짓된 할당이 전복되는 것은 아닐까? 근거의 세계는 자신이 배제하려고 기도하는 것에 의해, 자신을 열망하고 분산시키는 허상에 의해 잠식된다. 또 첫 번째 의미의 근거가 이데아나 이념을 내세울 때도 어떤 조건이 따라붙는다. 즉 이념이 그 자체로 소유하지 못하는 어떤 동일성, 단지 이념이 증명해주겠다고 주장하는 상대편의 요구들로부터 오고 있을 뿐인 동일성을 이념에 빌려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념의 현실화 과정은 유사성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것이고, 하물며 이념이 어떤 동일성을 함축한다는 것은 더욱 말이 되지 않는다. 이념의 '같음' 아래에는 어떤 다양성 전체가 으르렁거리고 있다. 또 이념을 어떤 실사적 다양체로, 같음의 사태나 일자로 환원 불가능한 다양체로 기술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충족이유가 재현의 요구들과는 무관하게 분만될 수 있음을 제대로 엿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충족이유는 본연의 다양체를 주파하고 이념에 상응하는 요소, 비율적 관계, 독특성들 등을 규정하는 가운데 스스로 분만된다. 이런 과정은 규정 가능성, 상호적 규정, 완결된 규정 등의 3중의 형태를 띠는 어떤 원리 아래에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 다양체적 충족이유는 도대체 어떤 바탕 위에서 태어나고 또 어던 유희에 빠져 드는가? 그 충족이유는 어떤 광기 속으로 뛰어들고 있는가? 이 충족이유는 방금 언급된 모든 것으로는 환원 불가능한 자신의 독특성과 ㅂㄴ배들을 도대체 어떤 유희로부터, 도대체 어떤 새로운 유형의 제비뽑기로부터 얻어내고 있는 것인가? 요컨대 충족이유, 근거는 기묘하게 휘어져 있다. 한쪽에서 근거는 자신이 근거짓는 것을 향해, 재현의 형식들을 향해 기울어져 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 근거는 모든 형식들에 저항하고 재현을 허락하지 않는 어떤 무-바탕, 근거 저편의 무-바탕 안으로 비스듬히 빠져 들고 있다. 만일 차이가 약혼녀, 아드리아드네라면, 이 차이는 테세우스에서 디오니소스로, 근거짓는 원리에서 보편적인 '근거와해'로 이동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근거짓는다는 것은 규정되지 않은 것을 규정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규정의 활동은 단순하지 않다. 실행 중에 있는 '본래적' 규정은 어떤 형상을 부여하는 데 만족하지 않는다. 범주의 조건들에 따라 어떤 질료들에 형상을 부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 것이다. 이때는 바탕에 있던 어떤 것이 표면으로 다시 올라오되 어떠한 형상도 취하지 않으면서 올라오고, 차라리 형상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온다. 그것은 얼굴 없는 어던 자율적 실존, 비형식적 기저이다. 이제 표면에 있는 한에서 이 바탕은 깊이, 무-바탕이라 불린다. 거꾸로 형상들은 이 무-바탕 안에 반영될 때 분해된다. 어떤 모델을 기초로 모형화된 모든 것은 파괴되고, 모든 얼굴은 죽어버린다. 여기서는 어떤 추상적인 선만이 유일하게 존속한다. 그 추상적인 선은 미규정자에 절대적으로 일치하는 적합한 규정에 해당하고 밤과 동등한 관명, 염기와 동등한 산, 애매성 전체에 적합한 판명한 구별, 곧 괴물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질료-형상의 짝은 규정의 메커니즘을 기술하기에는 너무 불충분하다. 질료는 이미 형상화되어 있고, 형상은 상이나 꼴에 따라 모형화되는 것과 분리될 수 없으며, 이 둘이 이루는 전체는 범주들의 혜택을 받고 있다. 사실상 형상과 질료라는 이 짝은 재현에 전적으로 내면적이고,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고정해놓은 최초 상태의 재현을 정의한다. 힘과 바탕의 상보성을 형상과 질료의 충족이유이자 이 둘의 결합의 충족이유로 내세운다는 것은 이미 어떤 진보에 해당한다. 하지만 질료들을 용해시켜버리고 모형화된 것들을 해체하는 추상적인 선과 무-바탕의 짝은 훨씬 더 심층적이고 위협적이다. 순수한 규정, 추상적인 선으로서의 사유는 미규정자인 이 무-바탕과 대결해야 한다. 이 미규정성, 이 무-바탕은 또한 사유에만 고유한 동물성, 사유의 생식성이기도 하다. 즉 그것은 이러저러한 동물적 형상이 아니라 다만 어리석음일 뿐이다. 왜냐하면 만일 사유가 강제와 강요의 상태에서만 사유하는 것이라면, 만일 그 어떤 것도 사유하도록 강요하지 않는 한에서는 사유가 멍청한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라면, 사유에게 사유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또한 어리석음의 현존이 아닐까? 다시 말해서 사유는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강요되지 않는 한에서는 사유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하이데거의 말을 인용하자면, "우리에가 가장 많은 사유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우리가 아직 사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사유는 최고의 규정이고, 마치 자신에 적합한 미규정자와 대면하고 있는 것인 양 어리석음과 대면하고 있다. 어리석음은 사유의 가장 큰 무능력을 구성하지만, 또한 사유에게 사유하도록 강요하는 것 안에서 사유의 가장 높은 능력의 원천을 구성하기도 한다. 부봐르와 페퀴세의 경이로운 모험, 혹은 무-의미와 의미의 유희가 이 점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하여 미규정자와 규정은 서로 앞지르지 않고 다만 동등하며, 하나는 언제나 다른 하나에 적합하게 일치한다. 어떤 이상한 반복을 통해 미규정자와 규정은 물레바퀴가 되고, 또는 차라리 똑같은 이중의 악보대가 된다. 체스토프는 도스토예프스키에게서 <순수이성비판>의 출구, 다시 말해서 그 완성과 퇴장을 보았다. 우리가 부봐르와 페퀴세에게서 어느 순간 <방법서설>의 출구를 본다 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코기토는 어리석은 자일까? 코기토 명제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의미를 언명한다고 주장하고, 그런 한에서 이것은 필연적으로 어떤 무-의미이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어떤 반-의미이다. 왜냐하면 규정 나는 생각한다는, 미규정자가 규정 가능한 것이 되는 형식을 지정하지 않은 채, 규정되지 않은 실존 나는 존재한다에 직접 효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데카르트적 코기토의 주체는 사유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사유할 가능성만을 지니고 있고, 또 이 가능성의 한복판에서 멍청한 상태에 빠져 있다. 그에게 결여된 것은 규정 가능성의 형식이다. 즉 어떤 종적 특수성, 질료를 꼴 짓는 어떤 종적 형상, 현재를 형상화하는 어떤 기억 등이 결여된 것이 아니라 다만 시간의 순수하고 텅 빈 형식이 결여되어 있다. 이 시간의 텅 빈 형식은, 추상적인 선에 이ㅡ해 균열된 어떤 나와 나에 의해 응시되는 무-바탕에서 비롯된 어떤 수동적 자아를 자기 자신의 이편과 저편으로 할당한다. 사유 안에서 사유를 낳는 것은 이 시간의 텅 빈 형식이다. 왜냐하면 사유는 오로지 차이와 함께 할 때만 사유하고, 근거와해가 일어나는 이 지점의 주위에서만 사유하기 때문이다. 사유, 다시 말해서 미규정자와 규정으로 이루어진 기계 전체가 기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차이, 또는 규정 가능한 것의 형식이다. 사유 이론은 마치 회화와 같다. 사유 이론에는 회화가 재현에서 추상미술로 이행하도록 만드는 바로 그 혁명이 있어야 한다. 어떤 이미지 없는 사유 이론이 설정하는 목표는 여기에 있다. p.582-588
사실 타인은 이 지각적 세계 전체의 작동방식을 근거짓고 보장하는 어떤 구조이다. 만일 타인이 있지 않다면 이 세계를 기술하는 데 필요한 기초 개념들 -형상과 바탕, 윤곽과 대상의 통일성, 깊이와 길이, 지평과 초점 등등- 은 공허하고 적용 불가능한 것으로 그치게 된다. 타인은 어떤 가능한 세계들을 표현하면서 있고, 그렇게 표현되는 세계에서는 (우리에 대해) 바탕 안에 놓여 있는 것은 동시에 어떤 가능한 형상으로, 깊이인 것은 동시에 어떤 가능한 길이로.....사전-지각되러간 지각 이하의 수준에서 지각된다. 대상들의 재단, 대상들의 이동과 결렬, 한 대상에서 다른 한 대상으로 향하는 이행, 또 심지어 한 세계가 다른 한 세계를 위해 지나간다는 사실, 언제나 함축된 그 무엇인가가 있어서 여전히 설명되고 전개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등의 이 모든 것은 오로지 타인-구조와 이 구조가 지각 안에서 지닌 표현 능력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된다. 요컨대 지각적 세계의 개체화[개인화]를 보장하는 것은 바로 타인-구조이다. 그것은 결코 나도, 자아도 아니다. 오히려 거꾸로 나와 자아는 어떤 개체성[개인]들로 지각될 수 잇기 위해 이 구조를 필요로 하는 형편이다. 모든 것은 마치 타인이 대상과 주체들의 한계들 안에서 개체화 요인과 전-개체적 독특성들을 통합하는 것처럼 진행되고, 이때 이 주체와 대상들은 재현에 대해 지각하는 것이나 지각되는 것들로 주어진다. 그런 까닭에 강도적 계열들 안에 있는 그대로의 개체화 요인들을 재발견하고 이념 안에 있는 그대로의 전-개체적 독특성들을 재발견하기 위해서는 이 길을 거꾸로 따라가야 한다. 또 타인-구조의 위치에서 행동하는 주체들로부터 출발하여 그 구조 자체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고, 다라서 타인을 '그 누구도 아닌 자'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 연후 충족이유의 팔꿈치를 따라 더욱 멀리 나아가 마침내 타인-구조가 자신이 스스로 조건짓는 주체와 대상들에서 ㅁ럴리 떨어져 더 이상 기능하지 않는 바로 그 지역들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p. 597-598
어쩌면 두 번째 반복의 모든 특성들을 기억에 귀속시키는 것은 그다지 정확하지 못한 일일 수 있다. 비록 기억이 어떤 순수한 과거의 초월론적 능력이고, 그런 만큼 능동적으로 기억하는 인식능력 못지않게 창의적인 능력이라 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은 두 가지 반복의 대립적인 특성들이 나타나는 첫 번째 형태이다. 이 반복들 중 하나는 자기 자신과 같은 어떤 것의 반복이고, 또 오로지 갈취되었거나 훔쳐낸 차이만을 지닌다. 다른 하나는 본래적으로 차이나는 어떤 것의 반복이고, 또 차이를 포괄한다. 하나는 어떤 고정된 항과 장소들을 지니지만, 다른 하나는 본질적으로 전치와 위장을 포괄한다. 하나는 부정적이고 결핍에 의한 반복이지만, 다른 하나는 실증적이고 과잉에 의한 반복이다. 하나는 요소들, 경우와 회들, 외생적 부분들의 반복인 반면, 다른 하나는 어떤 내적인 가변적 총체성들의 반복, 어떤 정도와 수준들의 반복이다. 하나는 매 순간 계속 이어지는 사실상의 반복이고, 다른 하나는 공존하고 있는 권리상의 반복이다. 하나는 정태적 반복이고, 다른 하나는 역동적 반복이다. 하나가 외연 안에서 일어나는 반복이라면, 다른 하나는 강도적인 반복이다. 하나는 평범한 반복인 반면, 다른 하나는 강도적인 반복이다. 하나는 평범한 반복인 반면, 다른 하나는 특이한 반복이자 독특성들의 반복이다. 하나는 수평적 반복이고, 다른 하나는 수직적 반복이다. 하나는 개봉되어 있는 반복이자 설명되어야 하는 반복이라면, 다른 하나는 봉인되어 있는 반복이자 해석되어야 하는 반복이다. 하나는 효과 안에서 성립하는 어떤 동등성과 대칭의 반복인 반면, 다른 하나는 원인 안에서 성립하는 어떤 비동등성과 비대칭의 반복이다. 하나는 정확성과 기계론적 특성을 띠는 반복이고, 다른 하나는 선별성과 자유의 특성응ㄹ 띠는 반복이다. 하나는 헐벗은 반복이어서 이차적이고 사후적으로만 가면을 쓸 수 있지만, 다른 하나는 옷 입은 반복이고 가면, 전치, 위장들은 이 반복의 처음이자 마지막의 요소들, 게다가 유일한 요소들이다. p.609-610
그런데 차이가 발산과 탈중심화를 역량으로 하고 있다면, 반복은 전치와 위장을 역량으로 한다. 반복은 차이 못지않게 이념에 속한다. 이는 이념에는 안은 물론 바깥도 없기 때문이다. (이념은 어떤 에레혼이다.) 차이와 반복은 이념에 의해 하나의 똑같은 문제가 된다. 이념에는 어떤 고유한 과잉, 어떤 과장이 있고, 이 과장을 통해 차이와 반복은 이념의 통일된 대상, '동시적 대상'이 된다. p.612
개념을 정지 상태에 빠뜨리거나 재현의 요구들을 전복하는 것, 그런 가운데 월등한 실증성을 구성하는 것은 언제나 이념의 과잉이다. 또 차이가 단지 개념적일 뿐인 어떤 차이로 환원되지 않게 된다는 것은, 반복이 차이와 가장 심층에서 연계되어 있고 자기 자신뿐 아니라 이 연계성에 대해서도 어떤 실증적인 원리를 발견한다는 것과 동시적인 사태이자 동일한 관점에서 성립하는 사태이다.(기억의 저편에는 죽음본능이 명백하게 보여주는 역설이 있었고, 이 본능은 그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처음부터 어떤 이중의 기능을 감당하고 있었다. 차이나는 것의 모든 힘을 반복 안에 포괄하는 동시에 반복을 가장 실증적이고 가장 과도한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그것이다.) p.612
만일 어떤 순환 주기들 속에서 자리를 바꾸고 같음의 사태 안에서 자신을 위장하는 차이가 없다면, 결코 그 같음의 사태는 자기 자신의 바깥으로 나와서 그 주기적 교체들 안에서 복수의 '비슷한 것들'로 분배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순환 주기들 속에서 자리를 바꾸고 같음의 사태 안에서 자기 자신을 위장하는 이 차이를 통해 반복은 명법적 성격을 띠게 된다. 하지만 여기서 외적 관찰자의 눈에는 오로지 헐벗은 것만이 보일 뿐이다. 이 관찰자는 그 변이형들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며, 그 변이형들 자체가 안으로부터 자기들 스스로 구성하고 있는 것에 대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믿는 것이다. p.614
강박증 환자가 한 차례, 두 차례 어떤 의례를 반복할 때, 가령 하나, 둘, 셋 하면서 수를 셀 때를 생각해보자. 그는 지금 외연적 요소들의 반복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반복은 어떤 다른 반복, 수직적이고 강도적인 반복을 추방하고 번역하고 있다. 여기서 번역되고 있는 이 반복은, 매번 혹은 매 숫자마다 자리를 바꾸고 수와 회들의 전체 안에서 자기 자신을 위장하는 어떤 과거의 반복이다. 이것은 병리학에서 찾을 수 있는 어떤 우주론적 증명의 등가물이다. 즉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원인과 결과들의 수평적 연쇄는, 총체적인 구속력이 있고 초세간적인 어떤 제 1원인을 요구하고, 이 제 1원인은 원인과 효과들 전체의 수직적 원인에 해당한다. p.615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두 번째 반복은 먼저 즉자적으로 공존하고 있는 과거의 원환들의 형태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과거와 현재가 공종하면서 만드는 어떤 원환의 형태로 나타나며, 마지막으로 대상=x를 중심으로 공존하고 지나가는 모든 현재들이 만드는 어떤 원환의 형태로 나타난다. 요컨대 형이상학은 자연과 물리학을 어떤 원환 안에 가두어놓는다. 그런데 심층적 반복이 어떻게 자신이 입김을 불어넣고 있는 헐벗은 반복으로 뒤덮이지 않을 수 있겠는가? 또 그 자신이 어떻게 김빠진 반복이 우위에 있다는 착각이나 가상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근거가 자신이 근거짓는 것의 재현 안으로 빠져 듦과 동시에 원환들은 같음의 행보에 맞추어 회전하기 시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원환들을 언제나 세 번째 종합 안에서 파괴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원환들은 언제나 세 번째 종합 안에서 파괴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세 번째 종합에서 근거는 어떤 무-바탕 속에서 폐기되고, 이념들은 기억의 형식들에서 벗어나며, 반복의 전치와 위장은 차이의 역량들에 해당하는 발산과 탈중심을 맞아들여 교미한다. 순환 주기들의 저편에는 무엇보다 먼저 시간의 텅 빈 형식이 만드는 직서닝 있다. 기억의 저편에는 죽음본능이, 공명의 저편에는 강요된 운동이 있다. 헐벗은 반복과 옷 입은 반복의 저편, 차이가 훔치기의 대상이 되는 반복의 저편과 차이를 포괄하고 있는 반복의 저편에는 차이를 '만드는' 반복이 있다. 근거지어진 반복과 근거짓는 반복의 저편에는 근거외해를 가져오는 반복이 있고 반복 안에서 묶는 것과 푸는 것, 죽는 것과 사는 것은 모두 동시에 이 근거와해를 가져오는 반복에 의존한다. 물리학적 반복과 심리적이거나 형이상학적인 반복의 저편에는 어던 존재론적 반복이 있는 것이 아닐가? 이 존재론적 반복의 기능은 다른 두 가지 반복을 제거하는 데 있지 않을 것이다. 그 기능은 오히려 한편으로는 그 두 가지 반복에 차이(훔쳐내거나 포괄된 차이)를 분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반복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상을 스스로 산출하면서 이 반복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빠져 드는 인접의 오류를 전개하지 못하도록 막는 데 있을 것이다. 이 궁극의 반복, 궁극의 연극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만, 달리 보면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선별하고 있다. 아마 예술의 최고의 목적은, 이 모든 반복들이 -본성상의 차이와 리듬상의 차이, 각각의 전치와 위장, 발산과 탈중심화 등을 동반하면서- 동시적으로 유희하도록 만들고, 이 반복들을 서로의 안으로는 물론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맞아 들어가도록 끼워 넣는 데 있을 것이며, 각각의 경우마다 그 '효과'가 변하는 어떤 가상들 안에서 이 모든 반복들을 봉인하는 데 있을 것이다. 예술은 모방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는 무엇보다 먼저 예술이 반복하기 때문이고, 게다가 어떤 내면적 역량을 통해 모든 반복들을 반복하기 때문이다. 예술작품에는 심지어 지극히 기계적인 반복, 지극히 일상적이고 지극히 습관적이며 지극히 천편일률적인 반복까지도 등장하곤 하지만, 이때 이 반복은 다른 반복들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전치되어 있고, 또 그 반복으로부터는 이 다른 반복들을 위해 반드시 어떤 차이가 추출될 수 있어야 한다. 사실 미학의 모든 문제는 예술을 일상적 삶으로 끌어들이는 데 잇다. 우리의 일상적 삶이 표준화되고 천편일률화되면 될수록, 또 점점 더 소비 대상들의 가속적 재생산에 굴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수록, 그만큼 예술은 더욱더 일상적 삶에 집착해야 한다. 그리하여 더욱더 이 일상적 삶에서 어떤 작은 차이를 끌어내어 반복의 다른 수준들 사이에서 동시적으로 유희하게 만들어주어야 하고, 심지어 소비의 습관적 계열들의 두 극단을 파괴와 죽음의 본능적 계열들과 더불어 공명하도록 만드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이로써 잔혹성의 장면을 어리석음의 장면과 결합하고, 소비 아래에서 정신분열증 환자가 어금니를 가는 소리를 발견해야 하는 것은 물론, 전쟁이 가져오는 지극히 비열한 파괴들 아애에서도 여전히 어떤 소비의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발견해야만 하며, 이 문명의 실질적인 본질을 이루고 있는 그 가상과 신비화들을 미학적으로 재생산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결국 본연의 차이가 가장 기이한 선별을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힘, 그 자체가 어떤 반복적인 분노에 찬 힘과 함께 표현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함이다. 물론 이때 이 선별은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는 어떤 수축에 지나지 않을 수 있고, 다시 말해서 어떤 세계의 종말을 위한 자유에 불과하더라도 예술은 이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각각의 예술은 서로 엇물리는 반복들의 기술들을 지니고 있다. 이 기술들의 비판적이고 혁명적인 능력이 최고의 지점에 도달할 때, 우리는 습관의 우울한 반복들로부터 기억의 심층적 반복들로 나아갈 수 있고, 게다가 우리의 자유가 노니는 죽음의 궁극적 반복들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 우리는 매우 상이하고 불균등할지언정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례를 지적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먼저 현대음악에서 모든 반복들이 공존하는 방식으로 바라. 그 다음 회화 부분에서 팝아트가 모사, 모사의 모사 등등을 밀고 나가 결국 모상이 전복되고 허상으로 변하게 되는 그 극단의 지점에까지 이르는 방식을 보라.(가령 워홀의 그토록 멋진 '계열발생적' 시리즈들에서는 습과, 기억, 죽음 등의 모든 반복들이 서로 결합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습관의 김빠지고 기계적인 반복들로부터 어떤 자그마한 양태변화들이 분리되어 나오는 소설 기법을 보라. 이 양태변화들은 다시 어떤 기억의 반복들에 활력을 불어넣고, 급기야 삶과 죽음이 노니는 어떤 훨씬 궁극적인 반복을 되살려놓는다. 물론 이런 결과는 어떤 새로운 선별을 끌어들이고, 그런 가운데 서로 공존하지만 서로와의 관계에서 각기 전치되고 있는 이 모든 반복들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p.619-622
그러나 이 세 번째 시간의 내용은 무엇인가? 시간의 형식 끝에 오는 이 비형식의 내용, 직선의 끝에서 자리를 바꾸고 있는 이 탈중심화된 원환의 내용은 무엇인가? 영원회귀에 의해 변용되고 '양태변화'를 겪는 이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가 입증하고자 했던 바와 같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허상, 오로지 허상들뿐이다. 허상들이 어떤 똑같은 역량을 통해 본질적으로 함축하는 것은 무의식 안의 대상=x, 언어 안의 단어=x, 역사 안의 행위=x 등이다. 허상들은 차이나는 것이 차이 그 자체를 통해 차이나는 것과 관계 맺는 그 체계들이다.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이 체계들 안에서는 어떠한 선행의 동일성도, 어떠한 내면적 유사성도 발견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계열들 안의 차이, 계열들의 소통 안의 차이의 차이가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이다. 계열들 안에서 스스로 전치하고 위장하는 것은 그 정체성을 확인할 수 없고 확인하지도 말아야 하며, 다만 차이의 분화소로서 실존하고 활동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런데 여기서 반복은 차이의 유희에서 필연적으로, 게다가 두 가지 방식으로 유래한다. 먼저 각각의 계열은 오로지 다른 계열들을 함축할 때만 설명되고 개봉된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계열은 다른 계열들을 반복하는가 하면, 자신을 함축하는 다른 계열들 안에서 반복된다. 하지만 각각의 계열이 다른 계열들 안에 함축된다면, 반드시 먼저 그 다른 계열들을 함축한다는 조건에서 함축되는 것이고, 그런 까닭에 한 계열은 어떤 다른 계열 안으로 되돌아오는 횟수만큼 자기 자신의 안으로 되돌아온다. 자신으로의 복귀는 헐벗은 반복들의 바탕이고, 마찬가지로 다른 것으로의 복귀는 옷 입은 반복들의 바탕이다. 다른 한편 허상들의 분배를 주재하는 유희는 수적으로 구별되는 각각의 조합의 반복을 보장한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주사위 던지기들'은 수적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형상적으로' 구별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결과들은 방금 전 환기된 함축되는 것과 함축하는 것의 관계에 따라 각각의 던지기에서 나온 숫자 안에 포괄된다. 이때 각각의 던지기는 던지기들 간의 형상적 구별에 부합하는 가운데 다른 던지기들 안으로 되돌아오지만, 또한 차이의 유희의 통일성에 부합하는 가운데 언제나 자기 자신 안으로 되돌아온다. 이런 모든 측면들에서 볼 때 영원회귀 안의 반복은 차이의 고유한 역량으로 나타난다. 또 반복되는 것의 전치와 위장이 하는 일은 운반에 해당하는 차이 운동, 그 유일한 운동 안에서 차이나는 것의 발산과 탈중심화를 재생산하는 것밖에 없다. 영원회귀는 차이를 긍정한다. 영원회귀는 비유사성과 계속되는 불일치를 긍정하고 우연한 것, 다양한 것, 생성 등을 긍정한다. 차라투스트라, 그는 영원회귀의 어두운 전조이다. 영원회귀가 배제하는 것, 그것은 정확히 차이의 목을 조르고, 차이를 재현의 4중 굴레에 종속시키면서 차이의 운반을 멈추는 모든 심급들이다. 차이는 오직 자신의 역량의 끝에서만, 다시 말해서 영원회귀 안의 반복을 통해서만 자기 자신을 되찾고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차이의 운반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은 영원회귀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이고, 영원회귀가 배제하는 것은 바로 재현의 전제들에 해당하는 같은 것과 유사한 것, 유비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재-현과 이것의 전제들은 다시 돌아오지만 단지 한 번만 되돌아올 뿐, 결정적인 어떤 한 순간, 한 번 돌아온 후에는 매번, 영원히 배제되기 때문이다. p.633-635
영원회귀는 '계속되는 불일치'의 외면적 효과에 해당하는 어떤 유사성의 이미지를 생산한다. 영원회귀는 자신이 긍정하는 것의 귀결, 자신의 고유한 긍정의 귀결에 해당하는 어떤 부정적인 것의 이미지를 생산한다. 영원회귀는 스스로 이런 동일성, 이런 유사성, 이런 부정적인 것 등으로 둘러싸이고, 또 자기 자신은 다시 허상을 둘러싼다. 하지만 정확히 말해서 이것들은 어떤 흉내뿐인 동일성이자 유사성, 흉내로만 부정적인 어떤 것이다. 영원회귀가 이것들과 더불어 유희를 벌인다면, 이 유희에서 이것들은 항시 제자리에 없는 어떤 목적, 항시 왜곡된 형태의 어떤 효과, 항시 빗나간 어떤 귀결 등에 불과하다. 즉 이것들은 허상의 작동방식에서 비롯되는 산물들이다. 영원회귀가 이것들을 이용한다면, 이는 매번 동일자를 탈중심화에 빠뜨리고 유사한 것을 일그러드리며 귀결이 엇나가게 만들기 위해서이다. 왜냐하면 사실 엇나가는 것들 이외읭 다른 귀결들은 없고, 일그러진 것들 이외의 다른 유사성들은 없으며, 탈중심화된 것들 이외의 다른 동일자는 없는 데다가, 또 제자리에 없는 것 이외의 다른 목적이 없기 때문이다. p. 637-638
둔스 스코투스에서 스피노자에 이르기까지 일의성의 옹호는 언제나 두 개의 근본적 테제에 기초하고 있다. 한 테제에 따르면, 존재의 형식은 복수적이지만 이 형식들은 범주들과는 달리 존재를 분할하지 않고, 그래서 존재 안으로 복수의 존재론적 의미를 끌어들이지 않는다. 다른 한 테제에 따르면, 존재를 언명하는 존재자는 본질적으로 변동적인 어떤 개체화하는 차이들에 따라 할당되고, 이 개체화하는 차이들은 필연적으로 '각자'에게 어던 복수의 양태적 의미작용을 부여한다. 이런 프로그램은 <에티카>의 초두부터 멋지게 개진, 증명되고 있다. 먼저 여기서 속성들은 어떤 유나 범주들로 환원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속성들은 형상적으로 구별되지만 모두 동등하고 존재론적으로 단일한 하나이기 때문이며, 또 그 속성들은 자신들을 통해 하나의 똑같은 의미에서 표현되거나 언명되는 실체 안에 어떠한 분할도 끌어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속성들 사이의 실재적 구별은 어떤 형상적 구별이지 결코 어떤 수적 구별이 아니다. 다른 한편 여기서 양태들은 어떤 종들로 환원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 양태들은 어떤 개체화하는 차이들에 따라 속성들로 할당되며, 이 개체적 차이들은 역량의 정도나 등급에 해당하는 강도 안에서 효력을 미치는 가운데 속성들을 직접적으로 일의적 존재와 관계짓기 때문이다.(다시 말해서 '존재자들' 사이의 수적 구별은 어떤 양태적 구별이지 결코 어떤 실재적 구별이 아니다.) 참된 주사위놀이는 바로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던지기들은 형상적으로 구별되지만 한판의 놀이에 대해서는 존재론적으로 하나이고, 떨어진 주사위들은 일의성의 단일하고 열린 공간을 통해 자신들의 조합들을 서로의 안으로 함축하고, 전치, 귀착시키는 것이 아닐까? 일의적인 것이 순수한 긍정의 대상이 되는 수준으로까지 나아가기 위해 스피노자주의는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된다. 그것은 실체로 하여금 양태들 주위를 돌게 만드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영원회귀 안의 반복에 해당하는 일의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p.641-642
모든 존재자들에 대해 존재의 단일한 아우성이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 먼저 각각의 존재자와 각각의 물방울은 각각의 길에서 과잉의 상태에 도달했어야 했고, 다시 말해서 자신의 변동하는 정점 위를 맴돌면서 자신을 전치, 위장, 복귀시키는 바로 그 차이에 도달했어야 했다. p.643
물론 최근의 운동들은 이들 예견 형태의 모순을 의문에 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내가 고민하는 문제는 미래에 관한 좋은 모델과 나쁜 모델을 지목하는 게 아니다. 내가 고민하는 문제는 단지, 오늘날 전 지구적 시간의 역사적 흐름, 지배 형태, 우리 삶의 시간이 맺는 관계를 사고하는 데 쓰이는 지배 모델들을 재검토하도록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다. 나는 이 지배 모델들과 관련하여 이중의 자리옮김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서사의 시간에서 이탈하도록 우리를 도울 수 있다고 자처하면서 유일한 현재에 몰두하는 분석들에 맞서, 나는 역사적 필연성의 서사가 해방의 약속을 미몽에서 깨어난 복종의 진술로 변환하거나 최종 파국의 예언으로 변환하는 대가로 지배적 시간을 어떻게 계속 구조 짓는지 증명하려고 노력했다. 나는 이 필연성의 서사 자체가 스스로 끈질기게 재생산한 위계적 시간 분할에 어떻게 뿌리박고 있는지 상기시켰다. 나는 위계적 시간 분할을 의문에 붙였고 지금도 그렇게 하는 계급투쟁 형태들과 서사 형식들에서 시간과 시간의 가능성들에 대한 다른 사유가 도출될 수 있는 방식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다. -자크 랑시에르, 모던타임스, p.41
그렇다면 이 말인즉 예술은 인류 일반의 태곳적 실천을 가리키는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술은 18세기 말 이래 서구 세계에 존재했던 역사적 짜임이다. 그전에도 기예-만드는 방식-는 많았다. 물론이다. 하지만 그것들은 인간 업무[점유]의 분할 -여기서는 위계를 뜻한다- 내에 둘러막혀 있었다. 그러한 분할은 기예가 특정한 경험 영역을 구성하지 못하게 가로막았다. 미술은 이른바 자유 학예의 파생물이었다. 자유 학예는 자유로운 인간의 오락이기에 공예와 구별됐다. 기예의 재현적 체제를 구조 짓던 원리는 인간 활동을 나누는 이 분할에 바탕을 두었다. 재현은 예술적 기술을 통한 현실 모방을 뜻하지 않았다. 재현이란 기예의 실천을 규칙의 전체 집합에 회부하는 모방의 법제를 뜻했다. 그 규칙들은 어떤 오브제나 캐릭터가 기예의 소재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고, 그 소재가 지니는 높낮이에 따라 어떤 기예 형태가 이런저런 소재에 부합하는지를 결정한다. 결국 재현은 기예의 생산물과 그 생산물이 관계하는 자들의 '자연적' 소질 사이 일치 체계에 기예적 실천을 기입하는 것을 함축했다. 그 '자연적 소질'은 실제로 위계적 사회 질서의 규칙이었다. 따라서 반-재현은 이 상응 집합의 파괴, 내 식으로 말하면, 감각적인 것의 나눔의 파괴를 뜻한다. 기예적 실천과 그 실천의 가시성 및 이해 가능성의 양식이 맺는 관계를 다시 나누는 것을 나는 미학적 혁명이라고 불렀다.
이로부터, 사람들이 미학적 혁명을 '역사화'하고 '정치화'하려고 할 때 기대는 개념들 특히 '모더니티', '모더니즘', 아방가르드 같은 개념들과 관련하여 두 결론이 따라 나온다. 첫째, 이 개념들은 재현적 체제의 논리를 붕괴시킨 변환들을 개념화할 수 없다. 오히려 그 개념들은 그런 변환에 대한 특수한 해석을 제공한다. 그 해석에 따르면, 그런 변환들은 '근대'의 요건을 충족시키려는 의식적인 예술 의지의 실행이다. 이 '충족'은 반직선one way line처럼 생각되는 역사 진화에 적응하는 것으로 아주 간단히 표현되는 경우가 잦았다. 그것은 '근대적 삶'(전기의 마법, 기계의 리듬, 자동차의 스피드, 강철과 콘크리트의 날카로움 등)의 가속화를 좇으려는 의지로 묘사되어왔다. 나는 사정이 그렇지 않음을 보이고 싶다. 오히려 모더니티, 모더니즘, 아방가르드 개념은 시간성의 복잡한 엮임, 현재, 과거, 미래 사이의, 예견과 지체 사이의, 단편화와 연속성 사이의, 운동과 부동 사이의 복잡한 관계 집합을 수반한다. 이유인즉, 내 생각에 모더니티의 쟁점은 단순히 수평선 위에서 과거와 현재가 단절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모더니티의 쟁점은 시간의 수직적 차원 곧 시간이 감각적인 것의 나눔에서 맡는 역할을 다룬다. 나는 이미 요점을 말했다. 시간이란, 과거에서 미래로 뻗은 선이기 이전에, 인간 존재를 나누는 형태이자 삶의 두 형태(시간 있는 자들의 삶의 형태와 시간 없는 자들의 삶의 형태)를 분할하는 형태이다. 나는 '모더니즘'이 그러한 나눔과 관련하여 무엇을 뜻할 수 있는지 다시 생각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p.72-75
내가 이 선언문을 강조하는 까닭은, 도래할 새 시대에 대한 그 믿음이 (그린버그가 아방가르드를 역설적으로 정당화하면서 [문을] 닫으려는 듯한) '모더니티' 시대의 개막으로서 반향을 일으키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린버그가, 아메리카 세계의 산문 속에서 새로운 시의 미래를 본 에머슨과 달리, 이 아메리카의 산문에서 급진적 분리 말고는 예술의 다른 미래를 보지 못했다는 사실만 중요한 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모더니즘 기획을 떠받치는 시간의 구축과 관련된다.
이 시간의 구축에서 첫 번째 요점은 현재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분할이다. 한편으로, 에머슨은 현재에서, 현재의 바로 그 '야만' 내지 혼돈 속에서 새로운 시적 영감을 찾아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에 주어진 이 특권은 시간성의 한 형태에 주어진 특권이다. 현재는 공존의 시간이다. 시는 아메리카의 현재를 이루는 다수의 이질발생적 현상에서 영감을 얻어야 한다. 시인의 과제는 그 모든 현상을 관통하는 공통의 실을 뽑아내는 것, 다양한 현상을 통과하는 삶의 잠재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구식 아리스토텔레스 모델은 시를 스토리 구축으로 만들어버렸다. 여기서 스토리 구축이란 사건의 잇달음을 인과 연쇄의 플롯 아래 포섭시키는 방식을 뜻한다. 시는 이제 구식 아리스토텔레스 모델과 대립하는 공존의 시간성, '민주적' 시간성을 바탕으로 성장해야 한다. 시는 이 공존에 그것의 정신적 표현을 부여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현재의 특권이 관계하는 바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 현재는 분할된다. 어떤 의미에서 현재는 자신에 대해 현재하지 않는다. 시간은 아직 '시의적절한 인간'을 만들어내지 않았다고 에머슨은 말한다. 이 말은 단지 시간이 아직 새로움을 표현하는 시를 만들어낼 지점에 다다르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다. 더 급진적인 방식으로, 그 말은 근대의 시간이 저 자신과 동시대적이지 않다는 뜻이다. '비동시대성'이라는 쟁점은 모더니즘을 정의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예술의 종언'에 관한 헤겔의 진단은 모더니티가 완수됐다고 하는 동시대성의 단언에 바탕을 둔다. 인민의 집단적 삶은 이제 경제, 입헌 정부, 행정부 같은 제도적 형태 속에 적절히 구현됐다. 역사의 진보를 추동해온 정신은 과학 속에서 자신을 의식하게 됐다. 조각된 돌, 그림의 표면, 시의 운율 같은 외적 물질성 속에 구현된 정신의 표현이던 예술이 그 실체적 내용을 상실하고 형식적 기교가 되는 경향을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예술이냐 모더니티냐, 이것이 헤겔의 딜레마이다. 이 진단을 논박하려면 진단의 배경이 되는 시간성의 세팅을 거부해야 한다. 우리는 '이후의 시간' 그러니까 예술이 그것의 내용을 상실해버린 알렉산드리아적 시간 속에 있지 않다고 에머슨은 말한다. 반대로 우리는 '아직' 모던하지 '않다.' 그러나 이 '아직 아님'은 그 자신이 분할된다. 한편으로, 이는 신대륙의 산문이 아직 제 표현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다. 우리는 이 새로운 현상들을 여전히 직접적 사용 가치와 추상적 교환 가치가 맺는 경제적이고 이기적인 관계 속에 갇힌 세속적 사물, 상황, 캐릭터로 보고 있다. 바로 그 사물, 상황, 캐릭터에 집단적 삶의 형태의 상징이라는 다른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 p.79-81
우리는 공동체의 새로운 직조를 예견할 수 있게 해주는 실을 모더니티의 바로 그 '지체'에서 찾아야 한다. 우리는 미래의 조화, 새로운 삶의 거친 박동을 현재의 시끄러운 부조화에서 찾아야 한다. 당시에는 그 용어[아방가르드]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도래하는 시인의 과제에 관한 에머슨의 정식화는 예술적 '아방가르드'가 무엇을 뜻할 수 있을지에 관한 최상의 관점을 우리에게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아방가르드는 군대의 선봉에 서는 첨병이 아니다. 그것은 승리를 구가하는 상품 문화 군대에 저항하는 최후의 부대도 아니다. 아방가르드는 근대가 자기 자신에 대해 갖는 차이에 위치한다. p.82
예술의 패러다임이 된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다음과 같다. 예술인 것과 예술 아닌 것 사이 관계의 패러다임이 된다는 것. 이를테면 미술관에 걸린 그림과 쇼윈도에 진열된 상품 사이 관계 혹은 무대 위 신체의 운동과 작업장이나 거리에서 신체가 시연하는 몸짓 사이 관계. 두 번째 의미는 다음과 같다. 사유와 사유 아닌 어떤 것 -그림의 빛, 멜로디의 전개, 공간 속 신체의 운동- 사이 관계의 패러다임이 된다는 것. p.129
무용의 순간은 무용이 어떤 예술관 -예술이란 사유가 그 사유 바깥에 현존하는 것이라고 보는 관념- 을 상징할 수 있는 순간이다. 무용의 순간은 이 현존을 상징하는 활동과 비활동의 동일성이 그것의 정치적 의미를 드러내 보이는 순간이기도 하다. 이 등가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감각적인 것의 나눔 전반에서 일어나는 혼란이다. 자유로운 운동은 단순히 삶의 보편적 홍수가 아니다. 그것은 두 종류의 인간 존재를 분리하는 차이를 폐지하는 운동이다. 한쪽에는 '능동적 인간'이 있다. 그들은 자신 앞에 행위의 목적을 투사하거나 오로지 행위 하는 즐거움을 위해 행위 하거나 나아가 여가의 순수한 비활동을 즐길 수도 있다. 다른 쪽에는 '수동적 인간' 혹은 '기계적 인간'이 있다. 그들은 노동을 하도록 운명 지어져 있고, 그들의 활동은 오직 직접적 목적의 직접적 수단이며, 그들이 소유하는 유일한 비활동 형태는 신체가 새로운 긴장에 앞서 필요로 하는 중지이자 이완이다. 무용은 그것이 예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는 만큼 새로운 예술이다. 새 패러다임은 예술을 감각적인 것의 전적인 재배분과 동일시한다. 이 재배분 속에서 신체, 운동, 시간성의 전통적 위계는 파괴됐던 것이다. 파도는 인류를 두 계급으로 분할한 위계적 시간, 운동의 기각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그러기에 태곳적부터 이어져온 파도의 자연적 운동은 산업의 신세계에 그러니까 전기의 세계에, 물질세계를 움직이는 비물질 에너지의 세계에 어울릴 수 있는 것이다. 자유로운 운동은 자유로운 인간과 기계적 인간을 나누는 구분의 폐지를 상징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목적과 수단이 더는 분리되지 않는 운동이기 때문이다. 이 비구분이 예술의 미학적 체제의 핵심에 있다. 그 비구분이 예술의 미학적 체제의 핵심에 있다. 그 비구분의 가장 유명한 정식은 칸트가 미에 관해 제시한 세 번째 정의에서 발견된다. "미는, 합목적성이 목적의 표상을 떠나서 어떤 대상에 있어서 지각되는 한에 있어서의, 그 대상의 합목적성의 형식이다." 이 비구분은 단순한 정치 혁명을 넘어서는 '인간 혁명'에 관한 독창적인 마르크스적 정식화의 핵심에 있다. 인간 혁명은 노동자들이 노동 -인간 존재의 본질적이고 유적인 활동- 을 그들 생존의 재생산을 위한 단순한 수단으로 사용케 하는 소외를 폐지한다. 무용은 대표적인 '미학적' 예술이다. 미학적 예술이기에 무용은 그 안에서 모든 활동이 동일한 전반적 운동의 일환으로서 평등해지는 공산주의 교향곡을 종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요점은 비단 새로운 무용 예술이 무엇을 상징하느냐에 국한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무용 예술이 자신을 어떻게 상징하느냐이다. 베르토프의 필름에서 무용수들의 퍼포먼스는 화면에서 터져 나우는 공동체의 활력 넘치는 에너지가 아니다. 퍼포먼스는 몽타주를 통해 다른 운동 이미지들과 절합되는 하나의 운동 이미지이다. 첫째, 무용수들은 오버랩 되면서 춤을 춘다. 무용수들의 이미지는 피아노 위에 등장한다. 무용수들 아래 건반 위에는 피아니스트의 손이 보인다. 그 손 뒤에는 역시 오버랩 된 이미지로 등장하는 지휘자의 몸짓이 보인다. 지휘자의 이미지는 이내 사라지지만 건반은 그 자체의 반사작용으로 증식되며 무용수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둘째, 무용 이미지는 청중의 이미지와 갈마들며 나온다. 셋째, 무용 이미지는 연속 운동이라는 동일한 이념에 따라 접속되는 다른 상징들로 연결된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들, 전화국의 교환원들, 타자수 부서의 타자수들, 거리를 지나는 버스들, 유명한 [공장의] 물레 이미지 그리고 그 위에 오버랩되는 여공의 미소 띤 얼굴까지, 요컨대 유일한 공통 운동이라는 이념은 한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와 부단히 관계 맺으면서 동시에 생산되고 배가되고 깨진다. 무용은 이때 단순한 통일성의 패러다임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 대신 관계의 패러다임을 제공한다. 그것은 언제나 다른 어떤 것과 접속되고, 언제나 다른 어떤 것을 나타낸다. p.137-140
풀러의 운동은 온통 동일한 기본 동작 패턴 -전후로 움직이는 동작, 자기 밖으로 확장됐다가 자기 안으로 틀어박히는 동작- 을 연기한다. 발레에서 이 전후로 움직이는 동작은 서사적 표현성과 기계적 기교라는 이중의 구속 -그것은 에투알[수석 무용수]과 무명 집단 사이 위계적 관계를 수반한다.- 에 의해 흡수되고 변질된다. 풀러의 무용은 에투알의 운동에 그것의 진실을 가져다준다. 개인의 자기 긍정은 확장을 거쳐 비-개인의 역량에 몰두한다는 진실.
풀러는 자신의 매체가 지니는 잠재성을 탐험하는 대신 하나의 환경을 창조한다. 풀러 보닝ㄴ의 운동이 그 안에서 "저 자신을 확장하는" 관계의 장소 혹은 매개의 장소가 되는 환경을 창조하는 것이다. 자신의 드레스를 펼쳤다 되접었다 하는 무용수의 인위적 퍼포먼스는 펼치기와 되접기, 나타남과 사라짐의 형태 전개에 관한 가장 추상적인 정식을 도출함으로써 하나의 공간을 창조한다. 펼치기와 되접기, 나타남과 사라짐의 형태들은 자연 현상들을 공통의 감각 세계의 형태들로 바꾼다. 일상적인 해의 뜨고 짐, 꽃들의 개화, 새들의 비행, 파도에 이는 하얀 거품, 하지만 이 "자기-확장"은 단순히 파도가 솟구쳤다가 떨어지는 것과는 다르다. 오히려 그것은 번역 운동이다. 그 단어[번역]의 두 의미에서 그러하다. 무용수의 운동은 "바다, 저녁, 향기, 거품의 장식적 도약"을 자기로부터, 자기 밖에서 해방한다. 운동은 일련의 환유를 통해서만 주어진다. 파도가 아니라 파도의 거품, 일몰이 아니라 저녁의 도약 등등. 더 중요한 것은 그 "바다, 저녁, 향기, 거품의 도약"이 무대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 도약은 무용수의 회전 운동을 가지고 관객이 몽상 속에서 하는 번역으로서만 존재한다. 비인격적 삶의 운동은 이중의 번역을 통해서만 존재한다. 자기 밖에 환경을 창조하는 무용수의 운동, 그리고 무용수가 동작으로써 말없이 써내려갔거나 써내려 갔을 수 있을 텍스트 중 하나를 번역하는 관객의 운동.
이 이중의 번역은 자유로운 운동의 패러다임을 복잡하게 만든다. 어떤 면에서는 풀러의 무용과 그 무용에 불이나 무지개 색을 비추는 스포트라이트의 합동 퍼포먼스가 제공한 "예술적 도취"와 "산업적 성취"의 결속에 관한 분석은 베르토프의 필름에서 발레리나들의 무용과 공장의 물레 사이 연합에 최고의 모델을 제공하는 듯 보인다. 하지만 동시에 그 분석은 퍼포먼스를 분할한다. 무용수의 퍼포먼스는 새로운 삶의 구현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새로운 삶을 '써내려가는' 한 방식이요, 공장에서 돌아가는 물레의 에너지 혹은 전화국 교환원의 몸짓을 번역하고 나서 차례로 그것들에 의해 번역되는 하나의 은유이다. 피스톤의 전후 운동을 흉내 내는 "무용 기계"는 필요가 없다. 대신 공장의 물레가 무용수의 회전 운동과 같아진다. 하지만 이는 또한 예술이 그 안으로 사라졌어야 했던 대편성 운동 교향곡이 여전히 은유들의 무대가 되고 있음을 듯한다. 그 무대 위에서 모든 활동은 무한정 차례차례 번역될 수 있는 이미지들이다. p.141-144
오히려 무용수 풀러는 써내려간다. 그런데 그녀가 써내려간 것은 발레의 어휘에 속하는 동작과 피겨의 구성이 아니다. 달리 말해, 그녀가 쓴 언어는 '운동의 언어'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형태의 은유"를 써내려가는 유사-언어로 머물 운명이다. 하지만 결국 이 은유는 비유 사전 어디에도 그에 맞춤한 번역어가 없다. 반대로 그 은유는 그것이 "말하는" 바의 바로 그 불확정성으로 작동한다. 무용은 칸트가 말하는 "목적 없는 합목적성"의 역설을 다른 어떤 예술보다 잘 구현하는 예술일지 모른다. 무용은 운동의 통상적 목적에서 분리[탈접속]되는 운동이지만, 운동 자체에 목적이 있는 연습을 단순 긍정 하는 것에 자신을 한정할 수 없다. 그래도 무용은 사실 아무런 목적지가 없도록 운명 지어져 있다. 무용은 다른 번역을 요구하는 하나의 번역이다. 무용이 텍스트가 아니면서도 다른 번역을 요구하는 까닭은 그것이 운동 이상이기 때문이다. 무용은 감각적 상태들의 종합이요 이질발생적 종합의 한 형태이다. 그리고 [그 종합은] 사전 없이 자신이 본 것에 입각해 [뭔가를] 짓는 번역자에 의해 번역됨으로써만 다시 말해 다른 종류의 종합을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다. 무용은 그것을 보는 자들이 다른 언어로 더 써내려가야 할 어느 텍스트의 번역인 것이다. p.148-149
근원적 무대란 기원의 무대가 아니라 '번역'의 무대인 것이다. 이제, 비-기원의 억압에든 기원의 억압에든 [그 양자에서] 동일한 일이 벌어진다. 그것[번역의 무대]은 다시 또다시 표면으로 떠오른다. p.149-150
퍼포먼스의 구축을 퍼포먼스 효과의 구축이라고 혼동하는 착각, 관객의 얼굴에 비친 반영은 오로지 번역의 환경을 통과하여 예술가의 퍼포먼스를 완성한다. 번역의 환경 속에서 예술가는 자신의 지배를 상실한다.
내가 퍼포먼스 자체보다는 퍼포먼스 필름에 대해 논평하고 있다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필름 덕분에 우리가 지각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퍼포먼스] '자체'를 의문에 붙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무용 퍼포먼스는 그저 움직이는 신체의 퍼포먼스로 환원될 수 없는 것이다. 무용은 예술의 기원이 아니다. 오히려 무용은 번역의 예술이다. p.153-154
WE DON'T WANT TO BE A FAMILY. WE WANT TO BE FRIENDS, OR LOVERS.
일상적인 상황, 더 나아가 한계-상황은 결코 희귀성이나 특별함을 통해 환기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순히 가난한 어부들의 화산섬이거나, 일개 공장, 학교...일 수 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과, 심지어는 죽음, 사고조차 일상적 삶 혹은 휴가 속에서 나란히 함께 간다. 우리는 비참과 압제의 거대한 조직을 다소간 관망하거나 또 감내한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인정하거나 참거나 혹은 동의하거나, 우리가 처한 상황, 능력, 취향 등을 고려한 결과로서 행동하기 위해 충분한 감각-운동적 구조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는 뭔가가 대단히 불쾌할 때 그로부터 고개를 돌리거나, 너무도 끔찍할 때 체념을 하거나, 너무도 아름다울 때 동화되거나 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은유조차 재빠른 감각-운동적인 제스처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뭔가 말할 것을 암시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은유는 감정적 본성을 갖는 특별한 체계에 속한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판에 박힌 것, 클리셰이다. 판에 박힌 것, 이것이야말로 사물의 감각-운동적 이미지이다. 베르그손의 말처럼 우리는 사물 혹은 이미지를 그 전체로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감해진 상태로 지각한다, 즉 우리에게 흥미로운 것만을 지각한다, 혹은 우리의 경제적인 이해관계, 이데올로기적 믿음, 또는 심리적 욕구에 따라 지각에 흥미로운 것만을 지각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판에 박힌 것들만을 지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감각-운동적 구조가 멎어버리거나 균열된다면, 그 때에는 또 다른 종류의 이미지가 출현하게 될 것이다. 사물 그 자체가 문자 그대로 공포 혹은 아름다움의 과잉 속에서, 근본적인 혹은 정당화될 수 없는 본성 그 자체 속에서 -왜냐하면 이미지란 좋든 나쁘든 더 이상 '정당화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출현하도록 하는 순수하게 시지각적-음향적 이미지, 은유 없는 이미지 그 자체....공장의 존재가 스스로를 드러내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은 일해야만 한다..." 라고 말할 수 없다. 나는 유형에 처해진 인간들을 본 듯했다. 공장은 감옥이다, 학교 역시 감옥이다, 은유적으로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감옥의 이미지와 학교의 이미지가 연속적으로 병치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일종의 유사, 즉 두 명료한 이미지 사이의 불분명한 관계를 지칭할 뿐일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애매한 이미지의 근저에서 우리를 빠져나가는 분명한 요소들과 그 관계들을 밝혀야 할 것이다. 즉 어떤 점에서 그리고 어떻게, 학교가 감옥이며, 대규모 주택단지가 매음굴이며, 은행가들이 살인자들이며, 카메라를 든 사진가들이 사기꾼들인가를 문자 그대로 은유 없이 보여줄 것. 이것이 바로 고다르의 <어떻게 괜찮은가?>의 방법론이다. 두 사진 사이에서 '괜찮은가' 혹은 '괜찮지 않은가'를 구하는 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각각이, 그리고 그 둘 모두가 '어떻게 괜찮은가'를 찾을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선행연구가 종국에 이르러야 할 문제이다. 즉 판에 박힌 것으로부터 진정한 이미지를 끄집어낼 것. -질 들뢰즈, 시네마 2: 시간-이미지, p.44-46
때로 우리는 잃어버린 어떤 부분들을 다시 복구하거나 우리가 이미지 안에서 보지 못한 모든 것, 우리가 이미지를 '이해관계 속에' 놓기 위해 삭제해버린 것들을 되찾아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때로 그와는 반대로, 균열을 만들고 공백과 빈 공간과 여백들을 이끌어들이고 이미지를 희소화하고, 그로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보았다고 믿게 하기 위해 덧붙였던 많은 것들을 제거해야만 할 것이다. 전체를 되찾기 위해 나누거나 빈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p.47
서사는 이미지 자체 내에 기원을 둔 것이지 주어진 하나의 소여가 아니다. 무성영화에서 볼 수 있는 쓰여진 것, 유성영화의 구어처럼 순수하게 영화적인, 그리고 내재적으로 영화적인 언표가 존재하느냐 하는 문제는, 이 언표의 특이성, 이 언표가 이미지와 기호 체계에 속하느냐를 결정짓는 조건, 간단히 말해 역반응과 관련한 전혀 다른 문제라 할 수 있다. p.69
기호란 또 다른 이미지(자신의 대상)에 대해 가치 있는 하나의 이미지로서, 자신의 '해석체'를 구성하는 세 번째 이미지와 관계하며, 이 해석체는 이제 역으로 하나의 기호가 되어 이렇게 끝없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미지의 세 가지 양태와 기호의 세 가지 양상을 조합함으로써 퍼스는 아홉 가지 기호적 요소와 그에 상응하는 열 개의 기호(모든 종류의 요소들의 조합이란 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를 이끌어낸다. 이미지에 대한 기호의 기능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인지적 기능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다. 기호란 그 대상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또 다른 기호 속에서 자신의 대상의 인지를 전제하고 거기에 해석체로서 기능하는 새로운 인식을 덧붙인다. 이것은 마치 끝없는 이중적 사행과도 같다. 혹은 같은 말이지만, 기호란 "관계를 효율적으로 만드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관계와 법칙이 이미지로서의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관계와 법칙이란 "필요한 경우" 이미지를 작동하게 할, 그리고 인식만이 이미지에 줄 수 있는 효율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p.71
지각이란 그 자체로 다른 이미지들 내로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각-이미지와 다른 이미지들 사이에 매개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경우에는, 이행으로서의 연장을 지시해줄 매개가 필연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결국 세 개의 이미지가 아닌 여섯 종류의 가시적인 감각적 이미지들을 얻게 되는 것이다. 지각-이미지, 감정-이미지, 충동-이미지(감정과 행동 사이의 매개), 행동-이미지, 반성-이미지(행동과 관계의 매개), 관계-이미지가 그것이다. 한편으로 연역은 유형들의 발생을 구성하고, 다른 한편으로 영도로서의 지각 이미지는 다른 이미지들 각각에 합당한 양극적인 구성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각 유형의 이미지들에 대해서 적어도 두 개의 구성 기호와 적어도 하나의 발생 기호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퍼스와는 다른 의미에서 '기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기호란 양극적인 구성의 관점에서건 혹은 발생의 관점에서건 한 유형의 이미지로 환원되는 특별한 이미지를 가리킨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시네마> 1권에서의 연구를 함축한다. 독자들은 그러므로 이 부분을 건너뛰어도 무방할 것이고, 앞서 우리가 퍼스에게서 몇 개의 용어를 변경하여 차용한 기호들의 요약을 단지 재검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각-이미지는 그 구성 기호로서 발화기호와 유상체를 갖는다. 발화기호란 지각의 지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영화에서 바라보고 있는 인물을 카메라가 '바라볼' 경우 나타난다. 이 기호는 견고한 프레임을 함축하며 이로서 일종의 지각의 고체적 상태를 구성한다. 반면 유상체는 끊임없이 프레임을 통과하여 지나가는 유동적인 혹은 액체적인 지각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기억흔적은 발생 기호 혹은 지각의 기체 상태, 즉 다른 두 개의 것이 전제하고 있는 분자적 지각이다. 감정-이미지는 구성 기호로서 특질 혹은 역량이라 할 수 있는 도상을 갖는다. 이것은 현실화되지 않고 단지 표현된(즉, 얼굴을 통해서) 특질 혹은 역량을 말한다. 그 발생적 기호를 구성하는 것은 특질기호 혹은 능력기호로서, 그것은 이 기호들이 임의의 공간, 즉 아직 실재적 환경으로 나타나지 않은 공간 내에서의 특질 혹은 역량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감정과 행동의 매개로서의 충동-이미지는 선 또는 악의 페티시로 구성된다. 페티시는 한 파생적 환경으로부터 분리된 단편이지만, 발생저긍로 이 환경의 기저에서 작동하고 있는 원초적 세계의 징후를 나타낸다. 행동-이미지는 하나의 포괄적 상황이 어떤 행동을 유발한다거나 혹은 그 반대로 한 행동이 상황의 어떤 부분을 드러낸다든지 하는, 현실화된 그러므로 충분하게된 실제 환경을 함축한다. 이것들은 또한 단일기호와 지표라는 두 구성 기호를 갖는다. 어쨌든 그 상황과 행동의 내적 관계는 발생 기호 혹은 흔적을 구성한다. 행동에서 관계로 이행해가는 반성-이미지는 행동과 상황이 간접적인 관계를 맺게 될 때 구성된다. 기호들은 이 때 견인의 혹은 역전의 형상들이 된다. 그 발생적 기호는 담론적, 즉 상담론적 상황 혹은 행동으로서, 이것은 담론 그 자체가 언어 내에서 실행되느냐는 질문과는 독립적이다. 마지막으로 관계-이미지는 운동이 그가 표현하는 전체와 관계하게 하고, 운동의 배분에 따라 전체가 변이되도록 한다. 두 구성 기호는, 표지 혹은 습관('자연적 관계')에 따라 두 이미지가 결합되도록 하는 정황과, 탈표시, 즉 한 이미지가 자신의 자연적 관계 혹은 계열에서 일탈되도록 하는 정황이다. 이 이미지의 발생 기호는 상징, 즉 비록 자의적으로 결합되었다 할지라도('추상적' 관계), 두 이미지를 비교할 수 있게 하는 정황이다. p.73-76
몽타주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이미지들이 연쇄되는가를 묻는 대신, '이미지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라고 묻는다. 이미지 그 자체와 몽타주의 동일성은 직접적인 시간-이미지의 조건 속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타르코프스키는 폭 넓은 깊이를 함축하고 있는 자신의 책에서, 시간이 쇼트 내에서 흐르는 방식, 그것의 긴장 혹은 희소화, "쇼트 내에서의 시간의 압축"이야말로 본질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어쩌면 그는 쇼트냐 몽타주냐 하는 고전적인 양자택일을 견지하면서, 열렬히 쇼트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영화적 형상은 쇼트 내에서만 존재한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외관일 뿐이다. 왜냐하면 시간의 힘, 혹은 시간의 압축은 쇼트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며, 몽타주란 그 자신, 시간 속에서 작동하고 시간 속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타르코프스키가 거부한 것은 오히려, 영화란 다양한 서열을 갖는, 상대적이기조차 한 단위들과 더불어 작동하는 하나의 언어라는 생각이다. 몽타주는 쇼트-단위에 행사되는, 그럼으로써 운동-이미지에 새로운 특질로서의 시간을 부여하게 될 더 상위 서열의 단위가 아니다. 만약 운동-이미지가 이미 시간의 주입에 의해 침윤된 것이 아니라면, 그래서 이 시간의 주입을 통해 몽타주가 운동-이미지 내에 자리잡아 운동을 변질시키지 않는다면, 운동-이미지는 완벽할 수 있으며, 형상을 갖지 않은 채, 무관심하고, 정적인 것으로 남게 된다. "쇼트의 시간은 독립적으로 흘러가야 한다. 혹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자기 자시의 주인으로서 흘러가야 한다." 바로 이러한 조건 속에서만 쇼트는 운동-이미지를 넘어서, 또 몽타주는 시간의 간접적 재현을 넘어서서, 양자 모두 직접적인 시간-이미지 속에서, 전자는 이미지 내의 시간적 형태 혹은 특히 시간의 힘을 결정하면서, 그리고 후자는 이미지의 연속 내에서의 시간의 관계 혹은 힘들의 관계(이 관계는, 이미지가 운동에 환원되지 않듯이, 정확히 말해 연속성으로 환원되지 않는다)를 결정하면서 서로 공감하도록 할 것이다. p.90-91
맨키비츠에게서 플래시백은 항상 인과성을 깨뜨리는 이러한 굴절된 이야기들 속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발견하며, 의혹을 불식시키는 대신 또 다른 의혹들로, 그리고 더 심층적인 의혹들로 되돌아가게 한다. <비올레트 노지에르>에서 샤브롤이 다시 실험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플래시백의 힘과 용법으로서, 샤브롤은 이를 통해 여주인공의 지속적인 분기, 그녀의 얼굴의 변화, 해소되지 않는 다양한 가정들(그녀는 자신의 어머니를 죽이기를 원했는가, 아닌가 등)을 드러내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플래시백에 필연성을 부여하고, 회상-이미지에 진정성과 과거의 무게 -이 과거의 무게가 없다면 회상-이미지는 관습적인 것에 머무를 것이다- 를 부여하는 것은 바로 시간의 분기성이다. 그렇지만 왜, 어떻게 그러한가? 대답은 간단하다. 분기 지점들은 대부분, 사후에만 그리고 주의 깊은 회상을 통해서만 드러날 정도로 지각이 불가능하다. 그것은 오직 과거로서만 얘기될 수 있는 이야기인 것이다. 이것은 이미, 맨키비츠와 아주 유사하다 할 피츠제럴드의 지속적인 문제이기도 했다. 무엇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우리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가? 바로 이러한 질문이 <세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에 등장하는 세 여인의 플래시백과 <맨발의 백작부인>의 해리의 기억을 지배하는 것이다. 아마도 이것이야말로 모든 문제들의 문제라 할 것이다. p.110
그러나 이 모든 경우에, 우리는 결코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단지, 어떤 이야기를 옮기는 과거의 기능으로서의 구성된 기억이 아닌, 미래에 올 또 다른 기억의 대상을 만들기 위해 현재 일어나는 것을 보유하는 미래의 기능으로서의 기억의 탄생을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맨키비츠가 아주 깊이 이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 기억이란, 과거가 아직 현재하는 순간에 이미 구성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러므로 이제 오게 될 어떤 목표 내에서 구성된 것이 아니라면 결코 회상할 수도, 얘기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기억이란 하나의 행위이다. 우리는 현재 속에서 이 현재가 지나가버렸을 때 미래에 사용하기 위해 기억을 만들어낸다. 바로 이 현재의 기억이 그 내부로부터 두 개의 소로 다른 요소, 즉 기술된 이야기에 나타나는 소설적 기억과, 기술된 대화에 나타나는 연극적 현재라는 두 요소가 서로 소통되도록 한다. 전적으로 영화적인 가치를 전체에 부여하는 것은 이 순환하는 제 3자이다. 맨키비츠 영화에 기억의 시각적, 청각적 탄생이라는 전적인 힘을 부여하는 것이 이 감시자 혹은 무의식적인 증인의 역할이다. 우리는 여기에 서로 구별되는 두 화면 밖 영역의 양상, 즉 분기를 발각하는 인물이 속하는 옆 공간과, 이 분기를 과거로 이끌고 가는 인물이 속한 너머의 공간이 유래하는 방식을 보게 되는 것이다. p.113
그런데 회상-이미지란 잠재적인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을 위해 하나의 잠재성(베르그손이 "순수한 회상"이라 부른)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회상-이미지는 우리에게 과거를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과거 '였던' 지나간 현재를 재현한다. 회상-이미지는 현실화된 이미지 혹은 현실화 과정에 있는 이미지로서, 현실적이고 현재하는 이미지와 함께 식별 불가능성의 회로를 형성하지 않는다. 그것은 회로가 너무 크거나 혹은 반대로 충분히 넓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어쩼든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유럽 51년>의 여주인공이 상기하는 것은 회상-이미지가 아니다. 그리고 한 작가가 플래시백을 통해 작업할 때조차, 그는 이 플래시백을 정초하는 다른 과정에 플래시백을 종속시키고, 또 회상-이미지를 더 심층적이라 할 시간-이미지에 종속시키고 있는 것이다. (맨키비츠뿐만 아니라 웰스, 레네 등도 또한).
주의 깊은 재인이 성공할 경우 이것은 확실히 회상-이미지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즉 내가 지난 주 그곳에서 만났던 것은 바로 이 사람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이야말로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던 감각-운동적 흐름을 다시 지속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베르그손은 다음과 같은 결론, 그리고 이후 영화를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게 될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끊임없이 되돌아온다. 주의 깊은 재인은 성공할 때보다 실패할 때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것을 가르쳐준다는 것이다. 우리가 회상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감각-운동적 연장은 정지된 채로 있고, 현실태적 이미지, 즉 현재하는 시지각적 지각은 운동적 이미지 혹은 그 접촉을 되살릴 회상-이미지와 연쇄되지 않는다. 그 대신 이미지는 오히려 고유하게 잠재적인 요소들, 즉 기시감으로 이루어진 감정 혹은 '일반적인' 과거의 감정('그를 꿈에서 본 것 같다...'), 환상이나 연극적 장면('그는 내게는 낯익은 어떤 역할을 연기하고 있는 것 같다...')과 관계하게 된다. 간단히 말해 우리에게 정당한 시지각적-음향적 상관항을 주는 것은 회상-이미지나 주의깊은 재인이 아니라, 오히려 기억의 동요 그리고 재인의 실패이다. p.116-117
회상-이미지와 꿈-이미지의 차이점은 정확히 무엇일까? 우리는 그 본성이 현실태로서 존재하는 감각-이미지로부터 출발했다. 그런데 회상, 혹은 베르그손이 '순수 회상'이라 부른 것은 반대로 필연적으로 잠재태적 이미지이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회상은 지각-이미지에 의해 소환됨에 따라 그 자신, 현실태가 된다. 지각-이미지에 상응하는 회상-이미지 내에서 현실화되는 것이다. 꿈의 경우에 두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나타난다. 한편으로 잠자는 이의 지각은, 의식에서 빠져나감으로써 그 자체로서는 포착되지 않는 무수한 현실적인 감각 -외부적이든 내부적이든- 이 산포된 상태에서 지속된다. 다른 한편으로, 현실화되는 잠재적 이미지는 직접적으로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미지 속에서 현실화되는 것으로서, 이 이미지는 그 자신 이제 또 다른 제 3의 이미지 속에서 현실화되는 것으로서, 이 이미지는 그 자신 이제 또 다른 제 3의 이미지 속에서 끝없이 현실화되는 잠재태적 이미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꿈은 은유가 아니라, 아주 커다란 회로를 긋는 일련의 형태변이인 것이다. 이 두 성격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잠자는 이가 흰색 반점들로 얼룩진 녹색 표면의 현실적인 빛의 감각에 몸을 내맡길 때, 잠자는 이의 내부에 자리잡은 꿈꾸는 이는 꽃들이 흩뿌려진 초원의 이미지를 상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이미지는 벌써 공들이 놓인 당구대의 이미지가 됨으로써만 현실화되고, 이 당구대의 이미지는 그 자신, 또 다른 것이 되지 않고서는 현실화되지 않는다. 이것은 은유가 아니라, 권리상 끝없이 연속될 수 있는 하나의 생성이다. 르네 클레르의 <막간>에서 밑에서 올려다본 무용수의 튀튀는 "꽃처럼 피어나고", 꽃은 "봉오리를 열고 닫고, 꽃잎을 펼치고, 수술을 뻗치면서" 무용수의 벌린 다리 속으로 다시 돌아온다. 도시의 불빛들은 체스 게임을 하는 남자의 머리카락 속에서 "불붙은 담배더미"로 변하고, 담배는 다시 "그리스 사원의 원주들, 그리고 이어 사일로의 원주가 되며, 이 때 체스판 위로 콩코드 광장이 투명하게 비쳐 나타난다." p.120-121
그러나 어떤 극점을 선택하든지 간에 꿈-이미지는, 각각의 이미지가 이전의 이미지를 현실화하고 다음 이미지에서 현실화되면서, 필요에 따라 자신을 시동시킨 상황으로 되돌아 오는 대회로에 종속된다는 동일한 법칙을 따르고 있다. 그러므로 이 회로 역시, 회상-이미지가 실재적인 것과 상상적인 것 사이의 식별 불가능성을 보증하지 않듯, 이 양자 사이의 식별 불가능성을 보증하지 않는다. 꿈-이미지는 꿈꾸는 이에게 꿈을 귀속시키고, 관객에게 꿈에 대한 의식(실재)을 귀속시킨다는 조건에 순응한다. 버스터 키튼은, 주인공이 영화관 장내의 반-어둠 상태에서 환히 불 켜진 스크린의 세계로 이행해가도록, 스크린과 유사한 프레임을 만들어서 의도적으로 그 분리를 강조하고 있다. p.123
이 결정체-이미지에서 증식된 거울들은 모든 거울을 깨뜨림으로써만, 그리고 자신들이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챈 후 서로를 죽임으로써만 쟁취할 수 있을 두 인물의 현실성을 포획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실태적 이미지와 이것의 잠재태적 이미지는 한 첨점 혹은 한 지점의 극단, 그렇지만 분명하게 구별되는 요소들이 부재하지는 않는(어떤 면에서 에피큐로스의 원자처럼) 물리적인 지점의 극단에서 가장 작은 내적 회로를 구성한다. 분명하게 구별되지만 식별 불가능한 이것이 바로 끊임없이 서로 교환되는 현실태와 잠재태이다. 잠재태적 이미지가 현실적이 될 때, 잠재태적 이미지는 마치 거울 혹은 완성된 결정체처럼 가시적이며 투명해진다. 그러나 이 때 현실태적 이미지는 그 자신 잠재적이 되어 다른 곳으로 보내어지고, 마치 이제 막 땅에서 추출해낸 결정체처럼 비가시적이고 불투명하며 어두워진다. 그러므로 현실태-잠재태의 쌍은 즉각적으로 그들의 교환의 표현이라 할 불투명-투명으로 연장된다. 투명한 면이 어두워지고 어두운 면이 투명성을 획득하거나 되찾기 위해서는 단지 조건들(특히 기온)이 변화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교환이 개시된다. 물론 두 면 사이의 구별은 존재하지만 조건이 명확하게 표명되지 않는 한 구별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은 과학과의 근접을 야기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자누시에게서 과학적인 영감과 관련하여 발전하고 있음을 발견하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자누시가 흥미를 갖는 것은 과학의 '권력', 과학과 삶의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학자 자신들의 삶 속으로의 과학의 투사이다. <크리스탈의 구조>는 정확히 두 명의 과학자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중 한 명은 전도 유망하고 이미 공식적인 과학 혹은 순수과학의 모든 지식의 빛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 다른 이는 불투명한 삶, 그리고 뭔가 분명치 않은 임무 속에 빠져 있다. 그러나 또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바로 이 어두운 면이 결국 빛을 발하게 되지 않는가? 비록 이 빛이 과학의 빛이 아니라 아우구스티누스의 '계시'와 같은 신앙에 근접해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반면에 순수과학을 대표하는 자들은 흥미롭게도 불투명해지고, 뭐라 고백하기 어려운 권력에의 의지를 담은 기획들을 추구하게 된다(<변장> <지상명령>). 자누시는 드레이어 이래로 가장 일상적이고 사소한 한정된 특 속에서 종교적이고 형이상학적인 혹은 과학적인 내용으로 대화를 풍요롭게 할 줄 알았던 작가군에 속한다. 그리고 이러한 성공은 바로 식별 불가능성의 원칙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무엇이 빛을 발하는가? 뇌의 절단면에 대한 명료한 과학적 도식, 혹은 기도하는 수도승의 어두운 두개골(<계시>)? 주어진 조건 속에서 무엇이 투명하고 무엇이 어두운지를 알길 없이, 분명히 구별되는 두 면 사이에서 의혹은 여전히 계속된다. <상수>의 두 주인공이 "꽁공 얼어붙어 진흙으로 뒤덮인 채 투쟁의 한가운데 있을 때 태양은 떠오르고 있다". 우리가 항상 자누시의 작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상조건처럼, 조건들은 환경으로 되돌려진다. 결정체는 더 이상 정면으로 마주한 두 거울의 외재적 위치로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대한 배아의 내재적인 배치로 환원된다. 자누시의 영화에 펼쳐져 있는, 눈보라치는 허허벌판과 같은 환경에 파종할 수 있는 배아란 무엇인가? 혹은 인간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경은 무정형인 채로 남고 동시에 결정체는 그 내부로부터 비워지면서 배아는 단지 치명적인 병이나 자살을 품은 죽음의 씨앗이기만 할 것인가(<나선>)? 식별 불가능성 혹은 교환은 이렇게 결정체적 회로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식을 통해 진행된다. 현실태와 잠재태(혹은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는 두 거울), 투명함과 어두움, 그리고 배아와 환경이 그것이다. 자누시는 영화 전체가 불확실성의 원칙이 갖는 다양한 양상들을 거쳐가게 했다.
자누시는 과학자를 배우로, 즉 탁월한 극적 존재로 만들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항상 배우 자신의 상황이었던 것이기도 하다. 결정체는 하나의 무대 혹은, 더 정확히 말해 원형경기장이 되기 이전의 트랙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배우는 자신의 대중적 배역에 비끄러매어져 있다. 즉 배우가 배역이 갖는 잠재태적 이미지를 현실적으로 만들 때 이 잠재태적 이미지는 가시적이 되고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다. 배우는 '괴물'이다. 혹은 오히려 괴물들이란 자신들을 엄습한 과잉 혹은 결여에서 하나의 배역을 발견한다는 의미에서, 이들이야말로 샴 쌍생아나 손발 없는 사람처럼 타고난 배우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배역의 잠재태적 이미지가 현실적이 되고 투명해질수록, 배우의 현실태적 이미지는 어둠 속으로 스며들어가고 불투명해진다. 여기에 배우의 어떤 사적인 기도, 어두운 복수, 이상스럽게 음험한 범죄적인 활동 혹은 법적 행위가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비밀스럽고 은밀한 활동은 중지된 배역이 다시 불투명함 속으로 침잠해 들어감에 따라, 역으로 드러나 가시적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토드 브라우닝의 주된 주제이며, 특히 그의 무성영화를 지배했던 것이다. p.147-150
이토록 이질적인 목록에 함선을 첨가해야 할 것 같다. 함선 또한 하나의 궤도, 회로이다. 터너의 그림에서처럼, 두 쪽으로 갈라진다는 것은 우연이라기보다는 함선이 갖고 있는 고유한 역량이다. 허먼 멜빌은 바로 자신의 소설 속에 이러한 구조를 영구히 확고부동하게 정착시켰다. 바다에 파종된 배아처럼, 함선읜 자시의 결정체적인 두 면 사이에 사로잡혀 있다. 모든 것이 질서 속에서 가시화된 함선 위쪽의 투명한 면, 그리고 수면 아래에서 일어나는, 배 아래쪽의 어두운 면, 즉 석탄 공급원들의 검은 면. 우리는, 투명한 면이 승객들 자신들을 엄습한 일종의 연극 혹은 극적 구조를 현실화하는 반면, 잠재태는 어두운 면 속으로 이행하여, 그 자신 기계 운전자들 사이의 결판이나 수부장의 악마적인 변태성, 선장의 편집증, 분노한 흑인들의 은밀한 복수 속에서 현실화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잠재태적 이미지의 회로는 끊임없이 서로에 대해 현실적인 것이 되고, 또 끊임없이 재추동된다. 함선의 영화적 구현이라 할 수 있는 것은, 휴스턴의 <모비딕>이라기보다는 많은 다대수의 결정체-이미지의 형상들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는 웰스의 <상하이에서 온 여인>이다. '키르케'라는 이름의 요트는 바로 가시적인 면과 비가시적인 면의 이중적 면을 증언하고 있는 것으로서, 순진한 주인공은 어느 한 순간 투명한 면에 사로잡히게 되지만, 반면 어두운 또 다른 면, 즉 괴물들이 우글거리는 수조의 거대한 어두운 장면은 투명한 면이 흐릿해짐에 따라 혹은 어두워짐에 따라 점점 침묵 속에서 드러나 확장된다. 또 다른 방식으로, 서커스의 궤도를 넘어 최후의 운명으로서의 함선의 회로를 재발견한 작가는 펠리니이다. 이미 <아마르코드>의 나룻배는 플라스틱 바다 위의 거대한 죽음 혹은 삶의 배아처럼 존재하고 있던 것이었다. 그러나 <그리고 항해는 계속된다>에서 함선은 상승하는 다변형의 면들을 증식시킨다. 함선은 우선 위와 아래, 둘로 분열된다. 함선과 수부들이 형성하는 모든 가시적인 질서는 승객-가수들의 거대한 연극적 시도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상단의 승객들이 아래쪽 하층민들을 보러올 때, 이번에는 하층민들이 상단의 승객들에 제청하는 노래 경연, 혹은 부엌의 음악 경연의 관객, 청객이 된다. 이어 분열된 틈새는 위치를 선회하여 이제는 갑판 위의 승객-가수들, 조난자-하층민들로 나뉜다. 바로 여기에서 다시 한번, 바르토크 식의 음악적 조함으로 현실태와 잠재태, 투명한 것과 어두운 것 사이의 교환이 이루어진다. 더 나아가 이 틈새는 거의 이중화된다. 탈주자들을 요구하는 맹목적이고 단호하며 무시무시한 어두운 전함은, 점점 더 속도를 더해가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이미지들의 회로를 통해 투명한 함선이 장례극을 완수함으로써 더욱 더 완벽하게 현실화되고, 이 아름다운 회로 속에서 두 함선은 바다에 회귀한 것을 바다로 돌려줌으로써, 즉 영원한 비정형의 환경, 모비딕에 값하는 멜랑콜리적인 코뿔소를 바다에 되돌려주면서 파열하고 침수함으로써 끝난다. 이것은 상호적 이미지, 즉 회화적이고 음악적인 세계의 종말에 선 결정체적 함선의 회로로서, 이 최후의 몸짓 속에서 젊은 편집광 테러리스트는 그 자신, 어두운 함선의 좁은 총안에 최후의 폭탄을 투여하고야 만다.
함선은 또한 죽은 자들의 함선, 교환의 장소로서의 소박한 교회당 내의 본당 회중석일 수도 있다. 죽은 자들의 잠재적인 생존이란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우리의 실존이 잠재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값을 치러야만 가능한 것은 아닐까? 죽은 자들이 우리에게 속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죽은 자들에 속하는가? 우리는 산 자들에 반하여 죽은 자들을 사랑하는 것일까, 아니면 삶을 위해서, 그리고 삶과 더불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인가? 트뤼포의 아름다운 작품 <녹색 방>은 아주 흥미로운 녹색 결정체, 즉 에메랄드를 형성하는 네 개의 면을 구성한다. 어느 순간 주인공은 녹색 빛이 어른거리는 반투명의 유리창이 달린 작은 방으로 숨어 들어가는데, 거기서 그는 산 자에 속한 것인지 혹은 죽은 자에 속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어떤 청록색의 삶을 얻게 되는 듯이 보인다. 그리고 교회당이라는 결정체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촛불들, 즉 늘 하나가 부족하여 '완벽한 형상'을 이룰 수 없는 불의 덤불을 보게 된다. 남자 혹은 여자는 끝에서 두 번째인 촛불만을 켤 수 있을 뿐, 결정체를 영원히 지속시키는 환원될 수 없는 삶의 지속성 속에서 마지막 촛대는 영원히 부재할 것이다. p.151-154
타르코프스키 특유의 물에 씻긴 것, 그리고 그 자체로는 다른 기능을 갖고 있지만 안토니오니 혹은 구로사와의 영화에서 볼 수 있을 만큼의 강렬함으로 각 영화에 리듬을 부여하는 비는 끊임없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낳는다. 어떤 불타는 덤불, 어떤 불, 어떤 영혼, 어떤 해면이 이 땅의 누수를 멈출 수 있을 것인가? 세르주 다네는 도브첸코 이후의 몇몇 소비에트 시네아스트들이 (혹은 자누시와 같은 동유럽의 시네아스트들이) 서구 영화에서는 운동-이미지를 통해 이미 제거되어버린 무거운 질료들, 아주 농밀한 정물에 대한 취향을 갖고 있음에 주목했다. 결정체-이미지에는 바로 이러한 질료와 정신 사이의 맹목적이면서 동시에 주저하는 듯한 상호적 탐색이 존재한다. 운동-이미지를 넘어서,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신앙하고 있나?' p.155-156
행동-이미지의 위기를 거치면서 영화가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한 우울한 헤겔적 반성을 통과해야 했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더 이상 서술할 이야기를 갖지 않고 있던 영화는 바로 자기 자신을 영화의 대상으로 삼았고 또 자기 자신의 이야기밖에는 더 이상 할 것이 없었다(벤더스).그러나 사실상 거울로서의 작업과 배아로서의 작업이 예술의 힘을 약화시키지 않고 항상 예술을 동반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예술이 이러한 작업에서 어떤 특별한 이미지들을 구성할 수 있는 수단을 발견해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영화 속의 영화란 역사의 종말을 알리는 것이 아니며, 플래시백이나 꿈처럼 그 자체로 자족성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아니다. 그것은 단지 다른 곳으로부터 자신의 필연성을 제공받아야만 하는 하나의 방식일 뿐이다. p.157-158
이것이 바로 영화를 침식하고 있는 오래된 저주이다. 돈, 그것은 바로 시간이다. 운동이 전체적인 교환 혹은 등가성, 대칭을 불변항으로서 지탱하고 있다면, 시간은 자연적으로 불평등한 교환의 음모, 등가적 관계의 불가능성을 나타낸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시간은 돈이다. 마르크스의 두 공식 중, M-A-M은 등가성의 공식이지만, A-M-A'는 불가능한 등가성 혹은 기만적이고 비대칭적인 교환의 공식이다. 고다르의 <수난>은 바로 이 교환의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시작한다. 그리고 벤더스의 초기 작품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시네아스트가 카메라를 모든 이동 운동의 일반적인 등가물로 취급하고 있다면, <사물의 상태>에서는 시간이 돈 혹은 돈의 유통이 되어버림으로써, 카메라-시간의 등가성이 불가능하게 됨을 드러낸다. 레르비에는 조롱 섞인 한 놀라운 강연에서 이미 이 모든 것을 말한 바 있다. 현대 세계에서 시간과 공간은 점점 더 값이 상승하여, 예술은 국제적인 산업 예술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예술은 "인간 자본의 상상적인 명목"으로서의 공간과 시간을 사기 위해 영화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바로 이것이 걸작 <돈>의 명시적인 주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영화의 암묵적인 주제인 것은 사실이다(톨스토이에게서 영감을 받은 동명의 영화에서 브레송은 돈이란 시간의 질서에 속하기 때문에 은총에 의하지 않고서는 악의 전적인 속죄, 모든 등가성 혹은 재분배조차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준다). 간단히 말해 동일한 고정 속에서, 영화는 자신의 가장 내밀한 전제인 돈과 직면하고, 운동 이미지는 시간-이미지에 자리를 내주게 되었다. 영화 속의 영화가 표현하는 것은, 이미지와 돈 사이의 끔찍스런 회로, 시간이 이 교환에 불러 일으키는 인플레이션, 이 '전복적인 앙등'이다. 영화, 그것은 운동이지만, 영화 속의 영화, 그것은 돈, 시간이다. 결정체-이미지는 이렇게 자신을 정초하는 원칙을 맞게 된다. 즉 끊임없이 비대칭적이고 불평등한, 그리고 등가적이지 않은 교환을 시동시킬 것, 돈에 반하여 이미지를 주고, 이미지에 반하여 시간을 줄 것, 자신의 첨점 위에 선 팽이처럼, 투명한 면으로서의 시간과 불투명한 면으로서의 돈을 전치시킬 것. 그리고 더 이상 돈이 남아 있지 않을 때, 영화는 끝날 것이다. p.159-160
그러나 문제가 심리사회적인 구조 -남성들로 하여금 성관계를 원치 않는 여성과의 성관계를 원하게끔 하는 구조, 혹은 남성들로 하여금 여성의 저항을 극복하는 것이 자기 일이라고 느끼게끔 하는 구조- 와 연관 있는 보다 심오한 것이라면, 캠퍼스 성폭력 방지법으로 얻을 수 있는 바는 훨씬 불분명해진다. 캐서린 매키넌이 지적했듯, '긍정적 합의' 법은 무엇이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섹스를 구성하는지와 관련해 목표물의 초점을 이동시킨 것일 뿐이다. 가령 과거에는 여성이 거절할 경우 남성이 멈추어야 했다면, 이제는 여성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가부장제가 낳은 이런 종류의 성관계를 금지하는 규정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너무나 어려운 이유가 그저 이 법이 잘못된 해결책이기 때문인 걸까?
캠퍼스 성폭력 방지법 같은 법이 특정 남성을 본보기로 만들어 다른 남성의 성관계 방식을 바꿀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고 해도 페미니스트들은 이 가능성을 받아들여야 할까? 매사추세츠대학교에 긍정적 합의 기준이 있었다면 콰드우 본수는 대학 측으로부터 '타이틀 나인'에 따라 성폭행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퇴학 처분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그가 강간 처벌 법규에 긍정적 합의 기준을 포함한 주(뉴저지주라든지 오클라호마주, 위스콘신주)에 속했다면 고소되고 체포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투옥되었을 수도 있다. 백인 여성에게 고소를 당한 흑인 남성으로서 그에겐 이런 상황이 불균형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이 대학의 준법률 조직이 본수의 삶을 산산조각 냈다. 이것은 피해를 호소한 여학생 자신도 원하지 않았던 결과처럼 보인다. 대학 측에 제출한 진술서에 그녀는 본수의 처벌이 "이 사건의 애매모호함을 감안해 가능한 한 온건하게 내려져야" 한다고 적었다. 만약 그녀가 강한 처벌을 원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래서 그녀를 더 안전하게 느끼게끔, 어쩐지 더 온전하게끔 만들어주었다고 가정해보자. 페미니스트들이 이런 비용을 기꺼이 감수해야 하는가?
나는 페미니즘이 남성들에게 더 나은 것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실은 더 나은 남성이 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가치 있는 페미니즘은 순간의 만족과 뻔한 비용을 수반하는 범죄와 처벌이라는 오래된 형태를 기계적으로 반복하지 않을 방법을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나는 가치 있는 페미니즘이라면 지금껏 남성들이 보여온 모습보다 더 나은 모습을 여성들에게 기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여성들은 단지 더 공정한 것에 그치지 않고 더 창의적이어야 한다. - 아미아 스리니바산, <섹스할 권리>, p.64-65
포르노그래피를 표현이라 말하는 것은 미국식 자유주의 사법체계 안에서 포르노가 특별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표현의 자유는 자유주의 사회가 가치를 부여하는 (또는 요구하는) 많은 것과 관련이 있다. 개개인의 자율성, 정부의 민주적 책임, 개인의 고결한 양심, 다름과 의견 불일치에 대한 관용, 진실 추구 등등. 미국에서 표현은 대체로 강력한 보호를 받고, 그 개념 자체('표현')도 보기 드물게 폭넓게 해석된다. 1992년 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조에 근거하여 미네소타주 범죄 조례에 따라 흑인 가족의 잔디밭에서 십자가를 불태운 백인 청소년의 기소를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일찍이 '세인트 폴 편견에 의한 범죄 조례'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 바 있었다. -공유지 또는 사유지에 불타는 십자가라든지 나치의 하켄크로이츠 같은, 그러나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 상징, 사물, 이름, 특징, 낙서를 갖다 붙이는 사람은 누구든 치안 문란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고 이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사람들은 그런 상징 등이 인종, 피부색, 신념, 종교, 젠더에 따라 타인에게 분노나 불안 또는 원한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알 만한 합리적 근거를 갖고 있다.- 제7연방항소법원의 중론을 적었던 스캘리아 판사는 어떤 '표현'에 드러나는 관점(가령 흑인의 열등함)에 기반해 그 '표현'(가령 십자가 불태우기)을 금지한 부분이 마음에 걸렸다. 스캘리아는 이런 관점이 혐오스러울 수는 있어도 여전히 하나의 관점이므로 표현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표현을 제한하는 일은 오로지 표현 형식을 근거로 할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고의로 날조된 표현(명예훼손과 비방)이나 아동 학대와 연관된 표현(아동 포르노그래피)이 그런 경우다.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표현은 그 내용을 근거로 금지하거나 억압할 수 없는데, 그렇게 하면 국가가 사상의 자유에 개입하게 되는 격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세인트 폴 조례는 (...) 논쟁에서 한쪽은 마음대로 싸울 수 있게 해주고, 반대쪽은 [권투 글로브 착용을 의무화한 최초의 권투 표준 규칙인] 퀸즈베리 [후작] 룰을 따르도록 요구할 권한이 없다"라고ㅗ 결론 내렸다. 다시 말해 인종 평등을 둘러싸고 백인 우월주의자와 흑인 사이에 벌어진 '논쟁'에서 국가는 어느 한쪽 편을 들어줄 수 없었던 것이다. p.100-102
나는 (...) 남근 중심주의 문화가 '그 남자가 그 여자를 찢어 죽이는 모습을 보라'는 식의 책보다는 여성을 위한 골반 부위 자가진단 책이나 레즈미어니즘에 대한 서정적인 찬가를 담고 있는 책을 숙청하는 검열을 시작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을 알고 있다. (...나는 남성들이 운영하는 사법부도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다. (...) 나는 검열이라는 게 흔히 판사석에 앉아 한 손으로 수많은 외설 서적을 뒤적이는 몇몇 남성 판사로 요약된다고 느낀다. p.107
그러나 섹스에 긍정적인 페미니즘을 자유주의에 귀속되었다고 예단하는 건 너무 쉬운 해석일 것이다. 페미니스트들과 게이 및 레즈비언 운동가들은 수 세대에 걸쳐 수치심과 낙인, 강압, 학대, 원치 않은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운 섹스를 위해 치열하게 싸워왔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필수적이었던 것은 섹스를 외부에서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성행위가 공적인 관점에서는 파악할 수 없는 사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우리의 이해 범주를 벗어나더라도 특정 섹스를 괜찮다고 믿으며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음을 강조하는 일이었다. 페미니즘이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사이의 자유쥬의적 구분에 의문을 제가할 뿐만 아니라 이를 요구하기도 하는 입장에 서게 된 것은 이런 과정을 겪은 뒤였다.
그러나 섹스 긍정주의와 자유주의는 우리 욕망의 형성에 관해 따져 묻지 않으려 한다는 점에서 서로 수렴하는 부분이 있으며, (고의는 아닐지언정) 이를 무마하는 건 정직하지 못한 태도일 것이다. 예를 들어 제3물결 페미니즘에 속하는 페미니스트들의 '성노동 또한 노동이며, 대다수 여성이 하는 하찮은 노동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말은 옳다. 그러나 '성노동자에게는 법적, 물리적 보호와 안전 및 보안이 필요하지, 구조와 갱생이 필요하진 않다'는 말도 맞는다. 하지만 성노동이 어떤 일인지(어떤 신체적, 정신적 행위가 사고팔리는가, 왜 성노동을 하는 사람은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고 구매자는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은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분명 남성 욕망의 정치적 형성에 관해 무언가를 이야기해야 한다. 물론 이와 관련해 교육과 양육, 돌봄, 보살핌 등 여성이 맡은 다른 형태의 일에 대해서도 할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성노동이 '단지 일'이라는 말은 남성의 일이든 여성의 일이든 모든 일이 결코 단지 일이기만 한 건 아님을 망각한 소리다. 그 일은 섹스화된 것이기도 하니까 말이다.
<성욕의 지평선> 결론부에서 윌리스는 "합의 상대는 자신의 성적 취향을 주장할 권리가 있으며, 권위주의적 도덕주의가 [페미니즘에서] 차지할 자리가 없음은 자명하다"라고 말한 뒤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진정으로 급진적인 운동은 (...) 선택할 권리 너머를 보고, 근본적인 질문들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어째서 우리가 선택한 것을 선택했는가? 진짜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윌리스의 입장을 놓고 보면 매우 이례적인 반전처럼 보일 수 있는 견해다. 윌리스는 어떠한 성적 선호건 간에 도덕적 심문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고정된 요소로 간주해야 한다는 윤리적 주장을 펼친 후, '진정으로 급진적인' 페미니즘이 '권위주의적 도덕주의'라는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한다. 정말로 자유롭게 성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여성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누군가는 윌리스가 한 손으로는 주고, 다른 손으로는 빼앗는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쩌면 윌리스는 양손 모두로 준 것일 수도 있다. 윌리스는 우리에게 말한다. 여기 페미니즘의 과제가 있다고. 성적 선택이 자유로워야 함을 중요하게 여기는 동시에, '안티섹스' 페미니스트들과 레즈비언 페미니스트들이 지적했듯 가부장제 아래에서 이러한 선택이 좀처럼 자유롭지 않은 이유를 알아야 한다고. 나는 우리 페미니스트들이 전자로 우르르 몰려가면서 후자를 잊어버릴 위험이 있다고 말하고 싶다. p.148-150
이 주장은 양날의 검이다. 만약 모든 욕망을 정치비평으로부터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면 트랜스여성을 배제하고 소외시키는, 특정 종류의 신체에 대한 성욕만이 아니라 여성성 자체를 '잘못된'부류의 여성과 공유하지 않으려는 욕망도 보호되어야 마땅하다. 추가 제시하듯, 정체성과 욕망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보는 관점은 그릇된 관점이다. 동성애가 선택이 아니라 타고나는 것(동성애자가 무엇을 원하는지가 아니라 누구인가의 문제)이라는 관념에 기초해 동성애자의 권리를 주장해서는 안 되는 만큼, 어떤 경우라도 그런 이분법에 기초해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욕망에 대한 정치비평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페미니즘은, 페미니즘을 가장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부당하게 겪는 배제와 잘못된 인식 앞에서 할 말이 별로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 양가적인 장소 -아무도 다른 누구를 욕망할 의무가 없고 아무도 욕망의 대상이 될 권리가 없을 뿐더러, 누가 욕망의 대상이 되고 누가 욕망의 대상이 안 되는지 자체가 정치적인 문제(곧잘 지배와 배제라는 보다 일반적인 패턴으로 답변되는 문제)로 받아들여지는 장소- 에 어떻게 머무를 것이냐다. 성적 주변화에 대응할 때 남성들은 여성 신체에 대한 권리의식을 동반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여성들은 보통 권리의식이 아닌 역량강화를 내세운다는 점은 놀랍진 않을지언정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또 설령 여성들이 권리의식을 입에 올리는 경우가 있다 해도, 이때 말하는 권리란 존중받을 권리이지 타인의 신체에 대한 권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긴 하지만 흑인 여성들, 비만 여성들, 장애 여성들 사이에 일어나는 급진적 자기에 운동은 우리에게 성적 선호란 완벽히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한다. '흑인은 아름답다'와 '큰 것은 아름답다'라는 슬로건은 역량강화의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치의 재평가를 제안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린디 웨스트는 비만 여성 사진을 연구하면서 (한때 그녀에게 수치심과 자기혐오를 안겨주었던 이러한 몸을 객관적으로 아름답게 여긴다는 것이 무엇일지 자문했다. 그녀는 이것이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지각의 문제라고 말하는데, 이는 곧 자신과 타인의 특정한 몸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면 혐오에서 흠모로 게슈탈트 전환이 일어난다는 뜻이다. 급진적 자기애 운동이 던지는 질문은 '섹스할 권리라는 게 존재하느냐'(존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욕망의 형태를 최선의 노력을 다해 바꿀 의무가 있느냐'다.
이 질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고정된 성적 선호라는 관념 자체가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우리는 좋은 정치라는 문제와 마찬가지로 타인의 선호 역시 신성하게 취급한다. 우리는 사람들이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혹은 이상화된 버전의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걸 당연히도 조심스러워한다. 그리고 알다시피 이런 식으로 권위주의는 거짓을 퍼뜨린다. 섹스에 관한 한, 그러니까 진짜 욕망 내지는 이상적인 욕망을 부르짖으며 여성 및 게이 남성에 대한 강간을 오랫동안 은폐해온 역사가 있는 섹스에 관한 한 이는 대부분 진실이다. 그러나 엄연한 사실은 우리의 성적 선호가 때론 우리 자신의 의지에 따라 바뀔 수 있고 또 바뀐다는 것이다(자동적으로 바뀌는 건 아니지만, 바뀌는 게 영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더욱이 수 세대에 걸쳐 게이 남성 및 여성이 증명해주듯, 성적 욕망이라는 게 우리가 인식하는 바와 늘 깔끔하게 맞아떨어지진 않는다. 욕망은 우리가 가보리라고는 상상도 해보지 못한 곳으로, 끌림이나 사랑을 느끼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에게로 우리를 이끌며 놀라움을 선사할 수도 있다. 최선의 상황에서는 우리의 욕망이 정치에 따른 선택을 거부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의 희망에 토대가 되어줄 것이다. p.159-162
4. 섹스할 권리란 없다(달리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강간범이나 할 법한 생각이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를 욕망하고 사랑하는지(욕망하거나 사랑하지 않는지), 또 누가 우리를 욕망하고 사랑하는지(욕망하거나 사랑하지 않는지)가 우리 사회 현실의 가장 추한 측면 -인종차별, 계급차별, 장애인 차별, 이성애 규범성- 을 통해 형성된다는 관측이 과연 '진부할 뿐'인 걸까?
5. 보다 명백하고 공적인 차원의 억압, 그리고 동호회와 데이팅앱, 침실, 학교 댄스파티를 포함해 억압을 가능케 하고 일부 구성하는 보다 은밀하고 사적인 메커니즘 사이의 분명한 연결점을 찾아낸 유색인과 노동계급, 퀴어, 장애인에게 이는 새로운 소식일 것이다. p.167-168
억압에 따른 왜곡으로부터 섹스를 해방해야 한다는 급진적 요구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는다면, 욕망을 훈련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우리의 욕망이 정치에 따른 선택을 거부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구절을 쓸 당시 나는 정의의 요구에 규제받는 욕망을 상상한 것이 아니라, 부정의의 속박에서 자유로워진 욕망을 상상하고 있었다. 나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체와 타인의 신체를 바라보고, 정치에서는 허락되지 않는 존경, 감사, 욕구의 느낌을 스스로에게 허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묻고 있다. 여기에는 일종의 규율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들어온 목소리, 어떤 신체와 어떤 신체의 존재 방식이 가치 있는지/없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목소리를 잠재울 것을 요구한다. 이때 훈련되는 것은 욕망 그 자체가 아니라 욕망을 가르치려드는 정치 세력이다. p.169
14. 시인이자 페미니즘 이론가인 에이드리엔 리치는 1980년 집필한 고전적 에세이 [의무적 이성애와 레즈비언 존재]에서 이성애가 인간 삶의 기본 형태이고, 레즈비어니즘은 기껏해야 성적 선호에 불과하며 최악의 경우 비정상적인 섹슈얼리티라는 (리치에 따르면 대다수 페미니스트가 받아들인) 생각을 비판한다. 리치의 요지는 이성애란 '이성애자' 여성마저도 (정신적 내면화를 통해, 그리고 폭력적 강요를 통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저버리게 하는 방식으로 친밀함, 호감, 관계의 규제를 강요하는 정치제도라는 것이다. 리치는 이성애자 여성들이 다른 여성들과 경험했던 친밀함과 공모의 순간을 생각해보았으면, 그리고 남성을 위해 이 경험을 (미성숙하고 불충분한 것으로 간주하며) 옆으로 밀어놔야 한다고 느꼈던 일은 반성해보았으면 하고 바란다. 남성의 관심을 얻고자 처으믕로 가장 친한 친구에게 등 돌렸던 때를 되돌아보라는 것. 이것이 리치가 이성애자 여성들에게 요구하는 바다. 과연 그 행동은 자연스러운 것이었을까? 불가피한 것이었나? 아니면 (여성의 욕망이 부재하는 상황 그리고 이와 더불어 남성이 여성의 신체, 노동력, 정신, 마음에 더 이상 접근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무엇보다 두려워하는) 남성 지배라는 하부구조가 당신에게 요구한 것이었나?
15. 당신이 다른 여성의 몸이나 얼굴, 매력, 여유로움, 탁월함에 느끼는 질투가 실은 질투가 아니라 욕망이라면? p.170-171
18. 선호가 선천성과 자주성을 가진다는 주장은 정치적으로 유용하다. 동성애자 인권 운동에서 '이렇게 태어났다'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는 트랜스젠더 인권 운동에서 '잘못된 몸에 갇혔다'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보라. 두 사고방식 모두 페미니즘의 구성주의적, 반본질주의적 경향과 (그리고 많은 동성애자 및 트랜스젠더의 경험과) 마찰을 일으키지만, 선택은 비난할 수 있어도 타고난 기질은 비난할 수 없는 세상에서 이런 사고 방식은 정치적으로 필수적이다. 정치적 주장은 흔히 변증법적이며, 규범적 영역에 대한 반응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규범적 영역은 우리가 바라는 어떤 미래가 아니라 우리가 주장을 하는 그 순간에 이미 존재하기 때문이다. p.172
23. '사람들에게 욕망을 바꾸라고 말하는 것'과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왜 원하며, 원하기 위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문하는 것'은 아무런 차이가 없을까? 욕망을 바꾸는 일이 꼭 (계획적으로 우리의 욕망을 우리 정치의 연장선상에서 바꾸는) 규율적인 프로젝트여야만 할까? (우리의 욕망을 정치에서 자유롭게 하주는) 해방 프로젝트일 수는 없을까? p.175
28. 앞선 세대의 페미니스트들은 이를 잘 알고 있었다.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은 자신이 일하고 양육하고 언쟁하고 의사결정하고 생활하고 사랑하는 방식을 재고하지 않았는데, 그건 이들이 부르주아적 도덕주의자였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의 구조적 본질이나 이것이 여성에게 부과하는 요구에 대해 혼란스러워하지 않았다. 페미니즘에 분리주의와 레즈비어니즘, 공유재산, 집단양육, 가족관계 해체, 여성성의 종말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지를 놓고 '개인적인 것'의 얼마만큼을 '정치적인 것'으로 만드느냐 하는 문제로 의견이 분분하곤 했던 것은 사실이다. 또 너무 멀리 나가게 되면, 예시적 정치(개개인에게 마치 다가올 세상에 이미 살고 있는 것처럼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정치)가 이에 순응하지 않는 이들을 소외시킬 뿐만 아니라, 순응하는 이들에겐 그 자체로 목적이 되어버리는 것 또한 사실이다. 최악의 경우 예시적 정치는 그 실천가들이 집단적, 정치적 변화를 개별적, 개인적 변화로 대체하도록 허락할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예시적 정치가 곧 자유주의 정치가 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예시를 거부하는 정치에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한다. '우리는 정치 세계를 변화시키고 싶지만, 우리 자신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대체 무얼 뜻할까?
29. 그렇다면 이제 진짜 질문을 꺼낼 차례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적 권리의식('섹스할 권리')의 여성혐오적 논리라든지, 해방하지 앟고 훈육하는 도덕적 권위주의에 빠져들지 않으면서 섹스에 대한 정치비평에 참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오드리 로드의 말처럼 우리 안의 왜곡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욕망을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면으로 돌아서지 않으면서, 정치적 프로젝트를 개인적인 것으로 바꾸지 않으면서 그리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실천적인 것으로서, 철학자들의 말처럼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아는 것의 문제다. 그리고 방법은 이론적 연구가 아니라 삶의 실험을 통해 찾을 수 있다. p.177-178
80. 인셀이 지위 -지위 높은 여성과의 성관계가 부여하는 지위, 이들이 지위 높은 여성과 만나기 위해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지위- 를 갈망한다는 솔닛의 견해는 맞는다. 동시에 인셀은 성 상품화를 싫어하며, 이것에서 해방되기를 원한다. 이들은 성이 시장 논리의 지배를 받으며 높은 지위의 여성이 자신들과 기꺼이 친절하게 성관계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싫어한다. 이것이 인셀 현상의 중심에 있는 까다로운 모순이다. 인셀은 자신을 패배자로 보는 성 시장에 반대하면서도 그 시장을 구성하는 위계에 집착한다.
81. 이 점에서 인셀은 병리적인 두 측면의 충돌을 보여준다. 한편에는 이른바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의 병리적인 측면이 있어서, 점점 더 많은 삶의 영역을 시장의 논리에 동화시키는 것이다. 다른 한편에는 가부장제의 병리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과 가정을 시장에서 벗어나는 피난처로,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돌봄과 사랑의 원천지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런 식으로 가부장제는 '자발적인' 헌신이 젠더 교육과 결혼의 실질적 필요성, 암묵적 위협으로 여성에게 요구하는 모든 방식을 외면한다. 이 두 측면이 부딪친다고 해서 서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거나, 유기적인 결합을 이루지 못한다는 뜻은 아니다. 셀마 제임스와 마리아로사 댈라 코스타, 실비아 페데리치가 1970년대에 지적했듯이, 그리고 이후로 줄곧 낸시 프레이저가 주장했듯이 여성적 돌봄의 장소로서 집은 시장 논리의 강압에 지친 남성에게 정서적, 성적 보상을 제공하면서 자본주의에 이바지한다. 이에 따른 숨겨진 대가는 가부장주의적 가정의 강요로, 주로 여성이 부담한다. 인셀의 진짜 불만은, 여성이란 지위를 부여하는 상품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이데올로기가 뒷받침하는 바로 그 시스템에서 벗어나게 해줄 여성이 없다는 것이다. p.204-205
85.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이 오랫동안 주장해왔듯 1960년대의 성 혁명이 우리를 부족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다우타트의 말은 옳다. 그러나 그의 주장처럼 '새로운 승자와 패자' 또는 낡은 위계를 대체할 새로운 위계를 탄생시키지는 않았다.
86. 사실 성 혁명에서 주목할 점은 '바뀌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다(이것이 급진적 페미니스트 세대의 정치가 형성된 이유다). 싫다는 말이 여전히 실제로는 좋다는 의미인 여성과 그냥 좋다고 말하는 여성은 지금도 헤픈 년이다. 흑인 남성과 갈색 인종 남성은 여전히 강간범이고, 흑인 여성과 갈색 인종 여성 강간은 여전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여자들은 여전히 이를 요구하고 있으며, 남자들은 여전히 이를 주는 범을 배워야 한다. p.207
즉 분석자는 분석 대상자를 사랑이나 적대감을 가지고 대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정서나 육체적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전이를 이용해서도 안된다(프로이트는 분석자에게 "환자의 사랑은 분석적 상황에 의해 유발되었을 뿐 분석자가 매력적이어서가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켜준다). 대신에 프로이트는 분석자가 치료 과정에서 전이를 치료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숙련된 분석자는 대상자가 자신에게 작용하고 있는 전이에 집중하도록 유도한다. 또 프로이트는 전이 느낌이 억눌려 있던 감정을 투영하는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대상자를 '설득하라'고(이 표현의 모호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다) 말한다. "이렇게 하면 전이는 가장 강력한 저항 무기에서 최상의 정신분석 치료 수단으로 바뀐다.(...) 분석 기술에서 가장 까다로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p.219
만약 현재가 현재함과 동시에 이미 지나간 것이 아니라면, 결코 현재는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과거는 더이상 현재이지 않은 현재에 연속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었던 현재와 공존하는 것이다. 현재, 그것이 바로 현실태적 이미지이며, 그것과 동시적인 자신의 과거, 이것이 바로 잠재태적 이미지, 거울 이미지이다. 베르그손은 "기억착오"(기시감, 기체감의 착각)란 다음과 같은 자명성을 인지 가능하게 할 뿐이라고 말한다. 즉 배우와 그의 역할만큼이나 밀착된, 현재 그 자체와 동시적인 현재의 회상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현실적인 존재성은 이것이 시간 속에서 펼쳐짐에 따라 점차적으로 잠재적인 존재성, 거울-이미지로 이중화된다. 우리 삶의 매 순간은 그러므로 이와 같은 두 가지 양상을 갖는다. 즉 그것은 현실태이면서 동시에 잠재태이며, 한편에는 지각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회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 지각과 회상으로의 지속적인 현재의 이중화를 의식하게 될 사람은, (...) 자신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자신이 연기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자동적으로 자신의 배역을 연기하는 배우에 비견될 만하다."
베르그손이 잠재태적 이미지를 "순수 회상"이라 부른 것은 이 이미지와 혼동될 여지가 있는 정신적 이미지들, 즉 회상-이미지, 꿈 혹은 몽상과 이를 더 잘 구별하기 위해서이다. 실상 이 정신적인 이미지들 또한 잠재태적 이미지들이라 할 수 있지만, 이것들은 의식 혹은 심리적인 상태 속에서 현실화된 혹은 현실화 과정에 있는 이미지들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이미지들은 필연적으로 새로운 현재, 즉 자신이었던 것과는 또 다른 현재와의 관계를 통해 현실화된다. 바로 여기에서, 연대기적 연속의 법칙에 따라 과거의 것 이후로 정의되고 또 과거의 것을 이전의 것으로 정의할 새로운 현재의 요구에 따른 정신적 이미지를 환기하는 다소간 확장된 회로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그러므로 회상-이미지는 낡은 것이 될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순수한 상태의 잠재태적 이미지는, 자신이(상대적으로) 과거가 될 새로운 현재와 관련하여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그것의 과거인 현행의 현재와 관련하여 정의된다. 잠재태적 이미지는 특수하지만, 아직 날짜를 부여받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보편적인 과거' 에 속한다. 순수한 잠재성으로서의 잠재태적 이미지는 현실태적 이미지와 엄격하게 상관적으로서, 현실태적 이미지와 함께 다른 모든 회로들에 기초 혹은 첨점의 구실을 하는 가장 작은 회로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현실화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 이미지는 또 다른 현실태적 이미지 속에서 현실화되거나 현실화되어야 할 필요도 없이 어떤 현실태적 이미지에 상응하고 있는 잠재적인 이미지이다. 이것은 전치 중인 현실태에 대한 잠재태의 현실화가 아니라, 즉각적인 현실태-잠재태의 회로이다. 유기적 이미지가 아닌, 결정체-이미지인 것이다.
잠재태적 이미지(순수 회상)는 심리적 상태 혹은 의식이 아니다. 잠재태적 이미지는 의식의 밖, 시간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공간 내에서 지각되지 않는 대상들의 현실태적 존재성을 어렵지 않게 인정할 수 있듯이, 시간 속에 존재하는 순수 회상의 잠재적 간청을 인정하는 데에도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은, 회상-이미지와 꿈-이미지 혹은 몽상조차, 필연적으로 이들에게 변덕스러운 혹은 단발적인 모양새를 부여하게 되는 의식을 끈덕지게 따라다니고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이것들이 의식의 순간적인 욕구에 따라 현실화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의식이 자신의 상태에 따라서 환기하게 되는 이 회상-이미지, 꿈-이미지 혹은 몽상을 어디로 구하러 가게 되는지를 질문해본다면, 그것은 순수한 잠재태적 이미지였고, 위의 것들은 이 순수한 잠재태적 이미지의 현실화의 양태 혹은 정도임을 알 수 있게 된다. 현재 있는 곳에서 사물을 지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지각하기 위해서는 사물 내에 자리잡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회상이 지금 거기 있는 곳으로 회상을 찾으러 가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보존하는 일반적인 과거, 이 순수한 잠재태적 이미지 내에 단번의 비약을 통해 자리잡아야 한다. 우리는 바로 그 자체 즉자적인 과거, 그 자체 즉자적으로 보존된 과거 속으로 꿈 혹은 회상을 구하러 가는 것이지, 그 역은 아니다. 오로지 이러한 조건 속에서만 회상-이미지는 자신을 다른 이미지 혹은 꿈-이미지로부터 구별하는 과거의 기호와 시간적 전망을 보유하는 변별적 기호를 갖게 될 것이다. 이 이미지들은 '근원적인 잠재성' 속에서 기호를 이끌어낸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앞서 우리는 잠재태적 이미지와 정신적 이미지, 회상-이미지, 꿈 혹은 몽상을 동일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 역시 불충분한 해결책이었지만, 그래도 바람직한 해결책을 모생하는 와중에 있는 것이라 하겠다. 과거와 현재 사이의 다소간 확장된, 그리고 항상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회로들은 한편으로 현재와 그 자신의 과거, 즉 현실태적 이미지와 그것의 잠재태적 이미지 사이의 내적인 소회로로 귀결된다. 다른 한편으로 이 회로들은 매번 모든 과거를 동원하는, 그리고 상대적인 회로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 자신들의 일시적인 수확물을 가져오기 위해 잠기거나 침잠해 들어가는, 차츰 깊어지는 그 자체로 잠재적인 회로들로 돌려진다. 결정체-이미지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양상, 즉 모든 상대적인 회로들의 내적인 한계와, 세계의 궁극에서 세계의 운동을 넘어서기조차 하는 곳에 존재하는 변이 가능하고 변형 가능한, 가장 바깥쪽의 외피라는 두 가지 양상을 갖는다. 작은 결정체적 배아와 결정화될 수 있는 거대한 우주. 즉 전체는 배아와 우주로 구성된 집합의 확장 능력 내에 포함되는 것이다. 기억,몽상, 혹은 세계들조차 이 전체의 변주에 의존하는 가시적인 상대적 회로들일 뿐이다. 이것들은 잠재태와 현실태의 두 극단 사이에 배치된 현실화의 정도 혹은 양태들인 것이다. 소회로 상에 존재하는 현실태와 그것의 잠재태, 그리고 더 깊은 회로 속으로 확장하는 잠재태들. 그리고 바로 이 내부로부터, 내적인 소회로는 단지 상대적인 회로들을 거쳐 직접적으로 심층에 있는 것들과 소통하게 된다.
시간의 가장 근본적인 작용은 결정체-이미지를 구성하는 것이다. 과거란 자신이었던 현재 다음에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시간은 매순간 서로 본성적으로 다른 현재와 과거로 이중화되어야 한다. 혹은 같은 말이지만, 하나는 미래로 비약하고 다른 하나는 과거로 침잠하는 이질적인 두 방향으로 현재를 이중화해야 한다. 시간은 스스로를 제기하거나 펼치는 동시에 분열된다. 시간은 두 개의 서로 다른 비대칭적인 투사를 통해 분열되는데, 그 하나는 모든 현재가 지나가게 하고, 또 다른 하나는 모든 과거를 보존한다. 시간은 이 분열로 이루어진 것이며, 우리가 결정체에서 보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분열, 이러한 시간이다. 결정체-이미지가 시간이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결정체에서 보는 것이 시간인 것이다. 우리는 이 결정체에서 시간의 지속적인 정초, 비연대기적 시간, 즉 크로노스Chronos가 아닌 크로노스Cronos를 보는 것이다. 바로 이 강렬한 비-유기적 삶이 세계를 둘러싸고 있다. 결정체 속에서 바라보는 자는 투시자, 견자이며, 이들을 바라보는 것은 이중화, 혹은 분열로서의 시간의 분출이다. 베르그손은 단지 이러한 분열이 결코 끝까지 가지 않는다고 덧붙인다. 사실상 결정체는 자신을 구성하는 두 변별적 이미지들, 즉 지나가는 현재의 현실태적 이미지와 보존되는 과거의 잠재태적 이미지를 끊임없이 교환한다. 이것들은 어느 것이 현실태이고 또 어느 것이 잠재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분명하게 구별되지만 식별할 수는 없는, 그리고 구별되는 만큼 더욱더 식별할 수 없는 것들이다. 이것은 불평등한 교환 혹은 식별 불가능성의 지점, 즉 상호적 이미지이다. 결정체는 항상 한계에서 살며 그 자신, "이미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즉각적인 과거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즉각적인 미래 사이에서 탈주하는 한계로서, (...) 끊임없이 지각을 회상으로 반사하는 움직이는 거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정체에서 보는 것은 이중화, 즉 결정체 자체가 끊임없이 자신 주위로 공전시키면서 그 완성에 이르기를 방해하는 이중화라 할 것인데, 이는 지속적으로 스스로를 구별화하기, 즉 형성 중에 있으면서, 항상 즉자적으로 그 자신, 구별되는 항들을 다시 취해 이들을 다시 끊임없이 발진시키는 구별화 작용이기 때문이다. "심연 구조는 외부적인 반사작용처럼 단위를 배가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재적인 거울화 작용으로서, 단지 단위를 이중화할 수 있을 뿐이며", 이 단위를 "끝없이 새로운 분열의 무한한 재발진"에 순응하게 하는 것이다. 결정체-이미지는 현실태와 잠재태라는 서로 명확히 구별되는 두 이미지의 식별 불가능성의 지점으로서, 이 때 우리가 결정체에서 보는 것은 인격으로서의 시간, 약간의 순수 상태의 시간, 끊임없이 자신을 재구성하는 두 이미지 사이에 존재하는 구별성 그 자체이다. 결정체의 형성화 작용과 거기서 볼 수 있는 형상에 따라, 결정체의 여러 다양한 상태들 또한 존재할 것이다. 앞서 우리는 이미 결정체의 요소들을 분석했지만, 아직 결정체의 상태들을 분석한 것은 아니었다. 이제 우리는 이 결정체 각각의 상태들을 시간의 결정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시간에 대한 베르그손의 대주제들은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과거는 자신이었던 현재와 공존하며, 과거는 보편적인(비-연대기적인) 과거로서 그 자체 즉자적으로 보존된다. 그리고 시간은 매순간, 지나가는 현재와 보존되는 과거, 즉 현재와 과거로 이중화되면서 분열된다. 때로 사람들은 베르그손주의를 다음과 같이 축소시키고는 했다. 즉 지속이란 주관적인 것으로서 우리의 내적 삶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베르그손 자신 또한 적어도 처음에는 이와 같이 표현해야 했던 것 같다. 그러나 이후 그는 점차 다르게 말하게 될 것이다. 유일한 주관성이란 시간, 즉 자신의 정초 중에 포착된 비-연대기적인 시간이며, 이 시간의 내부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지 그 역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가 시간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상식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또한 최상의 역설이기도 하다. 시간은 우리 안에 있는 내부가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그 안에서 존재하고, 움직이고, 살고, 변화하는 내면성이다. 이 점에서 베르그손은 그 자신이 믿었던 것보다 훨씬 더 칸트에 근접해 있는 것 같다. 칸트는 우리가 시간에 내재한다는 의미에서 시간을 일종의 내면성의 형태로 정의했다.(단지 베르그손은 칸트와 전혀 다르게 이 형태를 구상했을 뿐이다). 소설에서 프루스트는, 시간이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이중화되어 분열하면서 그 자신 스스로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고, 현재를 지나가게 함과 동시에 과거를 보존하는 시간에 바로 우리가 내재해 있는 것이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영화에서는 아마도 다음과 같은 세 영화가 어떻게 우리가 시간에 거주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 안에서 움직이는지, 즉 우리를 쓸어가고 주워담고 확장시키는 이 시간이라는 형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는 지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도브첸코의 <병기창>, 히치콕의 <현기증>, 레네의 <사랑해 사랑해>가 그것이다. 레네의 영화에서 볼 수 있는 불투명한 반원은 가장 아름다운 결정체-이미지로서, 이 때 우리가 결정체에서 보는 것은 인격으로서의 시간, 즉 시간의 용솟음침이다. 주관성은 결코 우리의 주관성이 아니라 시간, 즉 영혼 혹은 정신이라고 해야 할 잠재태이다. 현실태는 항상 객관적이지만 잠재태는 주관적이다. 이것은 우선 정서, 즉 우리가 시간 속에서 느끼는 것이었고, 이어 이것은 시간 그 자체, 즉 변용하고 변용되면서 둘로 분열하여 이중화되는 순수한 잠재성, 시간의 정의 그대로의 '자신에 의한 자신의 감화'라 할 수 있는 것이다. - 질 들뢰즈, <시네마 2: 시간-이미지>, p.161-168
모든 입구들이 다 가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가? 아마도 배아로서의 입구라면 그러할 것이다. 물론 배아들은 자신이 지각, 회상, 꿈, 환상 등으로 결정화하는 시지각적이고 음향적인 이미지들의 유형 사이에 존재하는 구별들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 구별들은, 배아와 결정체 사이의 등질성, 즉 결정체 전체는 성장 중인 더 큰 배아일 뿐이라는 등질성으로 인해 식별 불가능해진다. 단지 결정체란 질서화되어 정렬된 집합이므로 다른 여타의 차이점들이 개입되는 것이다. 어떤 배아들은 실패하고 또 어떤 것들은 성공하며, 어떤 입구는 열리지만 또 다른 입구들은, 마치 시선을 흐릿하게 벗어나 어두워지는 로마의 프레스코화들처럼 닫힌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예감을 갖는다 해도, 미리 무어라 말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어떤 선택이 행해진다고는 말할 수 있을 것이다(비록 르누아르와는 전혀 다른 방식을 통해서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펠리니의 걸작 중 하나인 <어릿광대>에 나타나는 입구들 혹은 연속적인 배아들을 보자. 종종 펠리니에게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첫 번째로 오는 것은 유년기의 회상이다. 그러나 그것은 곧 악몽과 가난의 인상들과 함께 결정화될 것이다. 두번째 입구는 어릿광대들의 인터뷰를 동반하는 역사적, 사회학적 앙케이트이다. 어릿광대들과 영화화된 장소들은 촬영 중인 팀들과 조응하면서 다시 한번 어떤 막다른 지대를 형성한다. 세 번째는 이중 최악으로서, 텔레비전의 사료보관서 내에서의 고고학적인 것이다. 이 세 번째 입구는 우리가 질서정연하게 배치하기까지, 적어도 상상력이 사료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설득한다(상상적인 것만이 배아를 숙성시킬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 입구는 운동적인 것이다. 그러나 서커스의 볼거리를 재현하는 것은 운동-이미지가 아니라 세계의 운동, 탈인격화된 운동을 재현하는 거울 이미지이며, 이것은 또한 어릿광대의 죽음을 통해 서커스의 죽음에 대해서 성찰한다. 어릿광대의 죽음이 보여주는 환각적인 지각, 죽음의 갤럽("좀 더 빨리, 좀 더 빨리")에서 영구마차는 어릿광대가 품어져 올라오는 샴페인 병으로 변한다. 그리고 이 네 번째 입구는 이제 마치 축제의 끝자리처럼 공허와 침묵 속에서 다시 닫히게 된다. 그러나 네 번째 입구에 버려진 늙은 어릿광대(그는 숨을 헐떡이며 떠나가고 있지만, 운동은 너무 빨리 가고 있다)가 이제 순수하게 음향적이고 음악적인 다섯 번째 입구를 열게 될 것이다. 트럼펫 소리로 그는 죽은 동료를 소환하고, 이에 또 다른 트럼펫이 화답한다. 죽음을 통해 이것은 '세계의 시작'과도 같은 것, 두 트럼펫 각각이, 그러나 또한 이 둘 모두 거울처럼, 메아리처럼 반향하는 음향적 결정체가 된 것이다.
결정체의 배열은 양극, 혹은 양면을 갖는다. 이러한 배열은 배아를 에워싸면서, 한편으로 결정체의 어두운 면을 구성하게 될 가속, 내달음, 그리고 때로는 비약, 파편화 등을 배아에 전달한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이 질서는 영원의 시련과 같은 투명성을 배아에 할당하기도 한다. <사티리콘>의 사막과 같은 묵시록적 풍경 속에는, 한 면에는 '구원된 자들!', 그리고 또 다른 한 면에는 '파멸된 자들!' 이라 씌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미리 뭐라 말할 수 없다. 어두운 면은 미세한 변화를 통해 투명하게 될 수조차 있으며, 투명한 면은 [8 1/2]의 클라우디아처럼 실망스러운 것으로 드러나거나 어두워질 수도 있다. 모든 배아들을 흰 아이 주위로 이끌어가는 [8 1/2]의 마지막 원무가 믿게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은 구원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카사노바>의 자동기계 여인으로 귀결되는 기계적인 경련과 죽음의 파편화처럼, 모든 것은 파멸로 끝날 것인가? 결코 전적으로 전자이거나 후자이지는 않을 것인데, 예를 들어 <아마르코드>의 플라스틱 바다 위에 뜬 죽음의 여객선 같은 결정체의 어두운 면은 스스로 벗어나 죽지 않는 또 다른 면을 지시하는 반면, [8 1/2]의 미래의 로켓과 같은 투명한 면은 배아들을 데려가기 위해 이것들이 벌집 혹은 파멸적인 내달음으로부터 빠져나오기를 기다린다. 사실, 선택이란 아주 복잡하고 또 그 얽힘은 아주 긴밀한 것이어서 펠리니는 데카당스의 냉혹한 흐름과 이를 필연적으로 동반하는 새로움 혹은 창조의 가능성을 동시에 지칭하기 위해 '프로카당스' 같은 단어를 만들어냈다(바로 이런 의미에서 펠리니는 자신이 데카당스와 부패의 전적인 '공모자'라 생각한다).p.179-181
펠리니의 영화에서 죽음의 무도를 형성하는 것은 현재, 혹은 지나가는 현재들의 행렬이다. 현재는 미래를 향해 질주하는 것이 아니라 무덤을 향해 질주한다. 펠리니는 가장 경이로운, 괴물들의 회랑들을 만들 줄 알았던 작가이다. 트래블링은 여기저기에서 멈추면서 이 회랑들을 편력하지만, 자신 속에 침잠한, 그러나 일순간 카메라에 방해된 맹금들처럼, 이 회랑들은 항상 현재에 포획되어 있다. 구원은 그러므로 다른 쪽, 즉 보존된 과거의 쪽에만 존재할 분이다. 바로 거기에서 고정화면은 인물을 고립시켜 행렬에서 빠져나가게 하고, 비록 일순간일지언정 그에게 그 자체로 영원한 기회, 즉 결코 현실화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영원히 가치를 가질 잠재성을 부여한다. 이것은 펠리니가 기억과 회상-이미지에 대해 특별한 취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펠리니의 영화에는 지나가버린 현재들에 대한 어떤 숭배도 존재하지 않는다. 펠리니의 영화에서는 오히려 페기의 세계처럼, 지나가는 현재들의 수평적인 연속은 죽음에의 질주를 그리는 반면, 각각의 현재에는 이를 마치 다른 현재들로 이루어진 과거와 결합하듯 자신의 고유한 과거와 깊이로 결합하는 수직적 선이 조응함으로써, 이들 사이에 유일하고 단일한 공존, 유일하고 단일한 공시대성, 즉 영원적인 것eternel이라기 보다는 '내원적인 것internel'이라 할 것을 구성한다. 마치 기독교인이 자신과 예수가 동시대에 속해 있다고 느끼는 것처럼, 우리였던 아이와 우리가 동시대인으로서 머물러 있는 곳은 회상-이미지가 아닌, 순수한 회상 속에서이다. 펠리니의 말처럼 우리 안의 아이는 어른, 노인, 그리고 소년과 동시대인이다. 바로 이렇게 스스로를 보존하는 과거는 시작과 또 다른 거듭된 시작의 모든 덕성들을 선취한다. 이 과거가 자신의 깊이 혹은 측면에 새로운 현실의 도약, 삶의 분출을 보유하는 것이다. <아마르코드>의 가장 아름다운 이미지 중의 하나는 일단 시즌이 끝난 거대한 호텔 앞에 모여 있는, 수줍은 아이, 익살맞은 아이, 몽상가, 모범생 등으로 이루어진 고등학생들의 무리를 보여준다. 그리고 눈 결정체가 떨어지는 동안 이들은 이제 각각, 그러나 다 함께, 누군가는 직선으로 가고, 다른 누군가는 원을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제자리에 돌면서, 때로 서투른 한 스텝의 춤을 시도하거나, 또는 악기의 흉내를 낸다.... 이 이미지 속에는 이들을 서로 분리하는 정확히 측정된 거리의 과학, 그러나 또한 이들을 결합하는 배열의 과학이 존재한다. 아이들은 더 이상 기억의 깊이가 아니라, 그들 자신들이 지나간, 그리고 이제 올 모든 '계절들'과 동시대인이 된 것처럼, 이제 우리 또한 그들과 동시대인이 된 공존성의 깊이 속으로 침잠한다. 지나가는, 그리고 죽음을 향해가는 현재와, 스스로를 보존하면서 삶의 배아를 간직하는 과거라는 이 두가지 측면은 끊임없이 서로 개입하면서 겹쳐진다. [8 1/2]에서 볼 수 있는, 빛을 발하는 소녀의 꿈 이미지와 잔을 나눠주는 흰 간호사의 꿈 이미지에 의해 중단되는, 악몽과도 같은 온천의 사람들의 행렬이 그런 것이다. 그 속도 혹은 느림이 어떠하든, 행렬, 트래블링이란 일종의 기마행렬, 기병행렬, 갤럽이다. 그러나 구원은 한 얼굴 주위로 향한, 혹은 이 얼굴 주위로 감기면서 이를 행렬에서 추출해내는 반복적인 리토르넬로로부터 온다. 이미 <길>은 떠돌던 리토르넬로가 결국 평화를 얻은 남자 위로 내려앉을 그 순간에 대한 탐구였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8 1/2]의 번민을 진정시키는 리토르넬로는 누구에게로 향할 것인가? 클라우디아? 부인 혹은 다른 애인들? 혹은 단순히, 구원될 수 있는 모든 것을 구하는 모든 과거에 내원적인 혹은 동시대인인 흰 아이? p.181-183
비스콘티의 세 번째 요소는 역사이다. 역사는 물론 해체를 이중화하고 가속화하며, 또는 이를 설명하기까지 하기 때문이다. 전쟁, 새로운 세력들에 의한 권력 찬탈, 새로운 부유층의 부상은 구세계의 은밀한 법칙에 침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라져버리게 한다. 그러나 역사란 결정체의 내적인 해체와 혼동되지 않는, 그 자체로 가치를 갖는 자율적인 요소로서, 비스콘티는 때로 역사에 눈부신 이미지를 헌사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역사를 생략시켜 화면 밖에 있게 하는 방식을 통해 더욱더 강렬한 존재감을 부여하기도 한다. 우리는 <루드비히>에서 거의 역사를 보지 않게 될 것이고, 단지 간접적으로만 전쟁의 공포와 프러시아의 권력 장악을 알게 되겠지만, 이는 루이 2세가 이 모든 것을 모른 체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더욱 더 강렬하게 나타날 것이다. 즉 역사는 문 앞에서 으르렁거리고 잇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센소>에서 역사는 이탈리아의 움직임, 유명한 전투, 그리고 이미 행해진 가리발디 군의 제거와 함께 바로 거기 현재한다. <저주받은 자들>에서는 히틀러의 부상, SS의 조직, SA의 몰살과 함께 역사는 바로 거기 있다. 그러나 현재하든 화면 밖에 있든 역사는 결코 배경이 아니다. 역사는 비스듬히, 나지막한 전망 속에서, 일어나는 혹은 스러지는 빛, 즉 마치 베니스의 페스트 혹은 새벽에 소리 없이 당도하는 SS처럼 외부에 있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압력으로 결정체를 자르고 그 내용물을 혼란시켜, 서둘러 혼탁하게 하고 결정체의 각 면들을 산포시키는 일종의 레이저 선과 같은 빛 속에서 포착된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까지 얘기했던 여타의 다른 요소들의 통일성과 순환을 보증하는, 비스콘티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네 번째 요소가 존재한다. 그것은 무엇인가가 너무 늦게 도래했다는 생각, 혹은 무엇보다도 무엇인가각 너무 늦게 도래했다는 깨달음이다. 제때에 인식되었다면 그것은 결정체-이미지의 자연적인 해체와 역사적인 붕괴를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제때 올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역사와 자연 그 자체, 즉 결정체의 구조이다. 이미 <센소>에서 비천한 애인은 "너무 늦었어, 너무 늦었어"라고 울부짖는데, 이 너무 늦음이란 우리를 둘로 갈라놓는 역사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너나 할 것 없이 썩어버린 우리의 본성과 관련해서도 너무 늦어버린 것이다. <표범>에서 공작은 시실리섬 전체로 퍼져가는 이 너무 늦음을 듣는다. 비스콘티가 결코 바다를 보여주지 않는 이 섬은 새로운 체제조차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의 자연과 역사의 과거 속에 묻혀 있다. 이 '너무 늦었다'는 끊임없이 <루드비히>의 이미지에 리듬을 부여할 것인데, 그것은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운명이기 때문이다. 너무 늦게 온 이 무엇인가는 항상 자연과 역사의 통일성에 대한 감각적이고 관능적인 깨달음이 된다. 이것은 단순한 결핍이 아니라 이 위대한 깨달음의 존재양식 그 자체이다. 너무 늦음은 시간 속에서 발생하는 우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시간 그 자체의 차원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시간의 차원인 이것은 결정체를 통해서, 결정체 내부에 살아남아 짓누르는 과거의 정적인 차원과 대립한다. 이것은 불투명에 대립하는 숭고한 명석함으로서, 그러나 그의 임무는 너무 늦게 오는 것, 역동적으로 너무 늦게 오는 것이다. 감각적인 깨달음인 너무 늦음은 세계 혹은 환경으로서 자연과 인간의 통일성에 관여한다. 그러나 관능적인 깨달음인 통일성은 개별적으로 형성 된느 것이다. 이것이 <베니스에서의 죽음>에서 소년으로부터 자신의 음악에 결핍된 것, 즉 관능적 아름다움에 대한 비전을 얻게 되는 음악가의 놀라운 깨달음이다. 이것은 또한 <폭력과 열정>의 부랑자와 같은 청년에게서 자신의 자연적 연인이자 문화적 아들을 발견하게 되는 교수의 견딜 수 없는 깨달음이다. 이미 비스콘티의 첫 번째 영화인 <강박관념>에서 동성애의 가능성은 짓누르는 과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기회처럼 나타나지만, 그러나 이 또한 너무 늦었다. 그러나 동성애가 비스콘티의 강박관념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표범>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들 중에는 늙은 공작이 가능한 한 구할 수 있는 것을 구하기 위하여 신흥 부유층의 딸과 자신의 조카의 연애결혼을 승인한 후, 이 여인과 춤을 추면서 그녀를 발견하게 되는 장면이 있다. 이때 이들의 시선은 서로 결합하고 서로는 상대편을 위해 존재하면서 서로에 속해 있는 반면, 조카 자신은 이 커플의 위광에 매혹되고 무화되어 배경 속에서 스러진다. 그러나 이 늙은 신사에게나 젊은 처녀에게나 모든 것은 너무 늦었다.
비스콘티가 작품 초기부터 이 네 가지 요소들을 제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종종 이 요소들은 여전히 잘 구별되지 않거나 서로를 짓누르고는했다. 그러나 비스콘티는 끊임없이 찾았고 또 이를 예감했다. 이미 여러 번 사람들은 <흔들리는 대지>의 어부들이 신흥 부자들과는 대립되는 자연적인 귀족성을 증언하는 느림, 위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에 주목했다. 그리고 어부들의 시도가 실패했다면, 그것은 단지 어선 하역 인부들 때문이 아니라 이들의 시도를 이미 너무 늦은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시대에 뒤떨어진 과거의 무게 때문이라는 것에 주목했다. 로코 역시 그 자신, 단순히 또 한 사람의 '성자'가 아니라 가난한 농부 가문에 속한, 본성적인 귀족이다. 그러나 마을은 이미 완전히 부패해버렸고 도 모든 것은 불투명해져버렸으며 역사는 이미 마을을 변화시켜버렸기 때문에 마을로 되돌아오기에는 너무 늦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비스콘티는 <표범>을 동해 이 네 가지 요소들을 조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를 완벽하게 통제하기에 이른 것 같다. 이 영화에서 가슴을 찟는 너무 늦음은 에드가 앨런 포우의 더 이상 결코 만큼이나 강렬한 것이다. 이것은 또한 비스콘티가 어떤 방향으로 프루스트를 영화적으로 번역할 수 있었을지를 설명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우리는 비스콘티의 탄식을 단지 그가 갖고 있는 외관상의 귀족적 염세주의로 환원시킬 수 없다. 예술작품이란 우리가 고통과 번민을 통해 어떤 상을 이끌어내듯 바로 이러한 탄식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너무 늦음은 예술작품을 조건짓고 또 그 성공을 조건짓는 것으로서, 그것은 자연과 인간의 감각적이고 관능적인 통일성이야말로 예술의 본질 그 자체이며, 그것의 본성은 바로 다음과 같은 것, 즉 되찾은 시간을 제외한 모든 것에 너무 늦게 당도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롱셀리의 말처럼, 미는 비스콘티에게 진정으로 하나의 차원이 된다. 즉 미는 "네 번째 차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p.188-191
기어깅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존재-기억 속으로, 세계-기억 속으로 움직여가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과거는 우리의 회상 혹은, 만약 그러한 것이 존재한다면, 우리의 최초의 회상이 전제하고, 또 우리의 지각 혹은 최초의 지각조차 이용하는 어떤 일반적인 전존재성, 이미 거기 있음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현재 그 자체란 단지 이미-거기 있음의 극단적 첨점에서 구성되는 한없이 수축된 과거로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는 이러한 조건 없이는 지나갈 수조차 없을 것이다. 현재란 그것이 과거의 가장 수축된 정도가 아니라면, 지나갈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실상 연속적인 것은 과거가 아니라 지나가는 현재라는 것이다. 반대로 과거는 다소 팽창된 혹은 다소 수축된 원들의 공존으로 나타나며 그 각각의 원은 동시에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잇고 현재란 그것들의 극한(모든 과거를 내포한 가장 작은 소회로)인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전존재로서의 과거와 한없이 수축된 과거로서의 현재 사이에는, 그 만큼의 지대들, 지층들, 늘려진 혹은 수축된 시트들을 구성하는 과거의 모든 원들이 존재한다. 즉 각각의 지대는 자신의 고유한 성격, '조성', '양상', '특이성', '광점', '주음' 등을 갖는 것이다. 우리가 찾는 회상의 성격에 따라 우리는 이런저런 원으로 뛰어들어야 한다. 물론 이 지대들(유년기, 청소년기, 성년기 등)은 마치 서로 연속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지대들은 그 각각의 한계를 이루는 과거의 현재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에만 서로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와는 반대로 실상 매번 그들의 공통적 한계 혹은 그들 사이의 가장 수축된 한계를 나타내는 현행의 현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지대들은 공존한다. p.202-203
만약 현재가 현실적으로 미래와 과거로부터 구별된다면 그것은 현재란 어떤 것의 현전이기 때문이며, 이 현전은 현재가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될 때 현재이기를 그친다. 바로 이 다른 어떤 것과 현재의 관계를 통해 과거와 미래는 하나의 사물이라고 말해지는 것이다. 그 때 우리는 다양한 사물들이 차례로 현재를 점유하게 하는 명시적인 시간 혹은 연속의 형식을 좇아 다양한 사건들을 따라가게 된다. 만약 우리가 단일하고 동일한 사건 내부에 자리잡게 된다면, 준비되고 발생하고 이어 사라지는 사건 속에 파묻혀 있다면, 혹은 실제적인 종단적 시선에 순수한 시지각적, 수직적 혹은 깊이라고 말할 수 있는 비전을 대체한다면, 사정은 이제 전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사건은 더 이상 그것이 발생하는 거점을 제공하는 공간과도, 지나가는 현행의 현재와도 동일시되지 않을 것이다. "사건의 시간은 사건이 끝나기 전에 끝나는 것이다. 그 때 사건은 또 다른 시간에 다시 시작될 것이다. (...) 다시 말하면 모든 사건은 아무 것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텅 빈 시간 속에서 우리는 회상을 예견하고 현실태로 존재하는 것을 해체하며 일단 형성된 회상을 위치시킨다. 이 경우 더 이상 식별 가능한 현재들의 명시적인 이행을 따르는, 연속적인 미래, 현재 그리고 과거란 존재하지 않는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멋진 공식을 따르자면, 사건 속에 함축되고 사건 속으로 둥글게 말린, 그리하여 동시적이고 설명 불가능한, 미래의 현재, 현재의 현재, 과거의 현재가 존재하는 것이다. 정서에서 시간으로. 우리는 이 세 개의 함축된 현재, 이 탈현실화된 현재의 첨점들의 동시성으로 이루어진, 사건 내부에 존재하는 시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세계, 생 혹은 단순한 하나의 삶, 혹은 에피소드를 단 하나의 동일한 사건으로서 다루게 될 가능성이며, 그것이 바로 현재들의 함축을 확고히 하는 것이다. 하나의 사건이 도래할 것이며, 도래하고 있으며, 도래했다. 그러나 동시에 사건은 발생할 것이고, 이미 발생했고, 그리고 발생하고 있는 중이다. 결국 발생해야만 할 것이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았고, 또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등등. 이것이 바로 카프카의 작품에 등장하는 생쥐 조세핀의 역설이다. 조세핀은 노래하는가, 노래했나, 노래할 것인가, 혹인 이 모든 것이 생쥐들의 집단적인 현재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차이들을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것도 아닐 것인가? 바로 동일한 시간에 누군가는 더 이상 열쇠를 갖고 있지 않거나(다시 말하면 열쇠를 가진 적이 있었고), 여전히 갖고 있거나(다시 말하면 잃어버리지 않았고), 그리고 열쇠를 발견한다(다시 말하면 열쇠를 갖게 될 것이고 동시에 열쇠를 갖고 있지 않았다). 두 인물은 지금 알게 되지만, 그러나 이미 알았고, 그리고 아직 알지 못한다. 때로, 어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배신하거나 혹은 그 역이거나 간에 모두 동시적으로, 배신은 행해지고 있고, 결코 행해지지 않았고, 그렇지만 행해졌고, 행해질 것이다. 우리는 이제 앞서 보았던 시간-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성질의 시간-이미지, 즉 더 이상 과거의 시트드르이 공존이 아닌, 현재의 첨점들의 동시성을 봅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종류의 시간-기호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 첫째는 양상들aspects(지대, 지층과 같은)이고, 그 두 번쨰는 액센트들accents(관점)이다. p.204-206
훨씬 더 시사적인 것은 <지난 해 마리엔바드에서>에서의 로브-그리예와 레네의 대면이다. 이 공동작업에서 놀라운 것은, 서로 다른 두 작가(왜냐하면 로브-그리예는 이 작품에서 단순한 시나리오 작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가 거의 대립적이라고 할 만큼 그토록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품을 구상했으면서도 그토록 응집력 있는 작품을 생산해냈다는 것이다. 아마도 이들은 이 작업을 통해 모든 공동작업의 진실, 즉 작품이란 단순히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상이한 창조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며, 이 과정들은 갱신 간으한, 그러나 매번 유일한 성취 속에서 결합되는 것임을 보여준다. 레네와 로브-그리예의 이러한 대면은 단순치 않으며 그들의 진솔한 우정어린 고백에 의해 그 참 모습이 가려져 있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층위를 통해 평가해볼 수 있다. 먼저, 운동-이미지의 위기를 통해 드러난 '현대' 영화의 층위가 있다. <지난 해...>는 이 위기의 중요한 계기일 수조차 있다. 감각-운동적 구조의 붕괴, 인물들의 정처 없는 떠돎, 클리셰와 우편엽서적인 이미지의 남발은 끊임없이 로브-그리예의 작품에 영감을 준 요소들이다. 그리고 로브-그리예에게 사로잡힌 여인과의 관계는 단순히 에로틱하거나 가학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기보다, 운동을 정지시키는 가장 단순한 방식이다. 그러나 레네와 마찬가지로, 정처 없는 떠돎, 부동화, 화석화, 반복 등은 지속적으로 행동-이미지의 전반적인 와해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p.210
레네에서 볼 수 있는 실재적인 것과 상상적인 것의 거대연속체는 로브-그리예의 불연속적인 블록 혹은 '쇼크'와 대립한다. 그러나 이 새로운 기준은 상상적인 것-실재적인 것의 쌍의 수준에서 개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제3의 층위라 할 시간을 개입시키는 것 같다.
로브-그리예 자신은 자신과 레네의 차이점이 궁극적으로 시간의 층위에서 찾아져야 한다고 암시적으로 말하고 있다. 행동-이미지의 와해와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식별 불가능성은 때로는 '시간의 건축'(이것이 바로 레네의 경우가 될 것이다)에 유용하고, 때로는 시간성으로부터 단절된 '영원한 현재', 즉 시간으로부터 소외된 구조에 유용해질 것이다(이것이 바로 로브-그리예 자신의 경우일 것이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서, 영원한 현재가 영원한 과거보다 시간-이미지를 덜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주저하게 된다. 순수한 현재는 순수한 과거만큼이나 시간에 속해 있다. 그러므로 차이점은 시간-이미지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 즉 첫 번째 경우의 조형적인 시간-이미지, 그리고 두 번째 경우의 건축적인 시간-이미지라는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레네는 <지난 해...>를 자신의 다른 작품들처럼 과거의 시트 혹은 지대들이라는 형식으로 구상한 반면, 로브-그리예는 시간을 현재적인 첨점들의 형태로 보았다. <지난 해...>를 서로 나눠 가질 수 있다면, X라는 남자는 레네에 훨씬 가깝고, A라는 여자는 로브-그리예에 더 근접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남자는 실상, 파도의 흐름과도 같은 지속적인 시간의 시트로 여인을 감싸려 하며 현재란 이 때 그것의 가장 좁은 시트라 할 수 있는 반면,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완강한, 그리고 때로는 거의 설득된 듯한 여인은 하나의 블록에서 다른 블록으로 뛰면서 두 첨점, 두 동시적인 현재 사이에 놓인 심연을 끊임없이 뛰어넘는다. 어쨌든 이 두 작가는 더 이상 실재적인 것과 상상적인 것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 즉 이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진실과 거짓이라는 훨씬 더 위험스런 영역에 위치하고 있다. 물론 실재적인 것과 상상적인 것은 그 회로를 계속하지만, 그것은 더 한 차원 높은 형상의 토대로서이다. 이제는 더 이상, 혹은 이ㅣ제는 단지 더 이상, 두 구별되는 이미지들의 식별 불가능한 생성이 아닌, 과거의 원주들 사이에서의 결정할 수 없는 양자택일, 현실의 첨점들 사이의 풀 수 없는 차이가 문제이다. 레네, 로브-그리예와 함꼐, 서로간에 반향된 두 대립된 시간의 개념에 기반하기 때문에 더욱 강렬한 어떤 묵계가 성립되었다. 잠재적인 과거의 시트들의 공존, 탈현실화된 현재의 첨점들의 동시성은 바로 인격으로서의 시간에 대한 직접적인 두 기호라 할 것이다. 피요트르 캄러의 <시간도시>라는 애니메이션 영화는 첨점들로 가공된 작은 공들과, 이 공들을 감싸고 있는 전연적인 시트라는 두 요소들로 시간을 주형하였다. 이 두 요소들이 순간들과, 반들반들하며 결정체로 이루어진, 그러나 이내 여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두워지고 마는 구들을 형성하게 된다. p.211-213
또한 <아카딘 씨>의 첫 장면에서, 커다란 안뜰에 등장하는 모험가는 이제 곧 우리가 그를 통해 탐색하게 될 과거로부터 다시 솟아나온 것이다. 간단히 말해, 이 두 번째의 경우에서 회상-이미지는 더 이상 자신이 재구성하는 지나간 현재들의 연속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가능케하는 공존하는 과거의 지대들 속에서 스스로 분발하여 튀어나온 것이다. 바로 이것이 심도의 기능이다. 즉 매번 과거의 어느 지대, 어떤 연속체를 탐색할 것.
여기서 바쟁이 '플랑-세캉스'라는 개념을 창안하면서 제기하고 종결시킨 심도의 문제들을 다시 거론해야만 할 것인가? p.215-216
이제 다른 여타의 차원을 종속시킨 이 깊이의 해방 속에서 한 연속체의 정복만이 아닌, 이 연속체의 시간적 성격을 봐야 할 것이다. 해방된 깊이가 공간이 아닌 시간의 차원을 갖도록 하는 것은 바로 지속의 연속성인 것이다. 이 깊이는 공간의 차원으로 환원될 수 없다. 깊이가 평행한 층위들의 단순한 연속 내에 포착되어 있는 한, 그것은 이미 시간을 재현하고 있다 할지라도 공간과 운동에 종속된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서 시간을 재현할 뿐이었던 것이다. 반대로 새로운 형태의 깊이는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층위들에서 차용된 시지각적 양상 혹은 시지각적 요소들로 정의되는 시간의 지대, 과거의 지대를 직접적으로 형성한다. 끊임없이 한 층위에서 다른 층위로 옮겨가는 국지화할 수 없는 관계들의 전체가 과거의 지대 혹은 지속의 연속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이 심도의 기능에 대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바쟁은 심도에 현실 기능을 부여했는데 그 이유는, 관객은 심도를 통해 이미 만들어진 이미지를 수용하기보다는 이미지 내에서 관객 그 스스로 지각을 구성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미트리는 심도가 관객으로 하여금 사선 혹은 안쪽으로 트인 구멍과도 같은 공간을 다라가도록 함으로써 마찬가지의 구속력을 갖는 구성방식임에 주목하면서 위의 견해를 부정했다. 그러나 바쟁의 입장은 훨씬 더 복합적인 것이었다. 바쟁은 이 현실성의 획득이 <게임의 규칙>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연극성의 과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임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연극성 혹은 현실성의 기능이 이 복잡한 문제를 다 해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우리가 보기에, 아주 다양한 심도의 기능들이 존재하며, 또 이 기능들은 모두 직접적인 시간-이미지에서 재규합되는 듯하다. 운동에 대한 시간의 종속성을 전치시킬 것, 시간을 그 자체로 드러낼 것, 바로 이것이 심도의 고유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심도가 시간-이미지의 독점적인 영역이라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로 아주 많은 종류의 직접적인 시간-이미지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깊이(심도뿐만 아니라 화면내의 깊이까지)의 제거를 통해 창조되는 시간-이미지들 또한 존재한다. 그리고 이 이미지의 평면화의 경우 또한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며, 드레이어, 로브-그리예, 지버베르크 등이 행하는 서로 다른 방식에서 볼 수 있듯이 시간에 대한 아주 다양한 개념화가 존재한다. 우리의 요점은, 심도란 기억, 과거의 잠재적 지대들, 각 지대의 여러 상들로 정의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직접적인 시간-이미지를 창조해냈다는 것이다. 이것은 현실의 기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기억술, 시간화의 기능이라 해야 할 것이다. 정확히 말해 회상이 아닌, '기억에의 권유'와도 같은....
이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기 전에 먼저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심도가 전적인 필연성을 갖고 존재하게 되는 대부분의 경우 이는 항상 기억과 관련해서라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영화는 다시 한번 베르그손적이라 할 것이다. 이 때 문제가 되는 것은 관습적으로 플래시백이 표현하는, 회상-이미지를 통해 만들어지는 심리적 기억이 아니다. 또한 연대기적 시간을 따라 진행되는 연속적인 현재들의 문제도 아니다. 여기서 문제인 것은 혹은ou bien 현행의 현재 내에서 산출된, 그리고 회상-이미지들의 형성에 앞선 환기의 노력이거나, 혹은 차후 출현하게 되는 과거의 시트에 대한 이 회상-이미지의 탐색이다. 이것은 기억의 형이상학적 두 극점이라 할 심리적 기억의 이편, 그리고 저편이라 할 것이다. 베르그손은 이 기억의 두 극점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과거의 시트들의 확장, 현행ㅇ의 현재의 수축. 이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은 회상을 환기한다는 것은 잠재적으로 감추어져 있다고 가정된 과거의 지대로 점프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으로서, 모든 시트들 혹은 지대들은 환기가 출발하는 수축된 현실적 현재에 대하여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반면에 이 지대들은 자신들이었던 현재들에 대해 심리적으로 연속되어 일어난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심도란 때로는 현실화 중에 있는 환기를 보여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찾고 있는 회상을 발견하기 위해 탐색하고 있는 과거의 잠재적 시트들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첫 번째 경우인 수축은 <시민 케인>에서 아주 빈번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카바레의 넓은 홀에서 술에 취해 가물가물한 수잔을 향해, 마치 환기를 촉구하듯이 그녀에게 다가가는 부감 장면이 그것이다. 혹은 <위대한 앰버슨 가>에서 깊이로 고정된 한 장면 전체는 젊은이가 자기 고모에게 어떤 본질적인 추억을 상기하도록 은근히 강요함으로써 정당화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심팜> 도입부의 앙각 화면은 법정이 자신에게 비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력을 다해 찾고 있는 주인공의 노력의 출발점을 나타낸다. 두 번째 경우는 <시민 케인>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비스듬한 횡단선의 깊이를 보여주는 장면에서 나타나는데, 이 장면 각각은 잠재적 비밀, 즉 로즈버드가 은폐되어 있는 곳은 바로 거기인가라고 질문하게 하는 어던 과거의 시트에 조응한다. 그리고 <아카딘 씨>의 연속되는 인물들은 최초의 수축된 노력에 대해 공존하고 있는 모든 과거의 시트들, 그리고 또 다른 시트를 향한 릴레이와도 같다. 우리는 이제 회상-이미지 그 자체란 별다른 흥미가 없는 것이며, 그것은 자신을 넘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것을 전제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된다. 우리가 찾으러 가는 과거의 시트들의 변주, 그리고 항상 되풀이 시작되는 탐색이 출발하게 되는 현행하는 현재의 수축성. 심도는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즉, 극단적인 수축에서 거대한 시트로, 혹은 그 역으로 갈 것이다. 웰스는 "동시에 공간과 시간을 뒤틀고 차례차례 이것들을 팽창시키고 수축시키면서 상황을 지배하거나 그리로 함몰해 들어간다". 사각의 트래블링과 측면의 트래블링이 시트들을 형성하듯, 부감과 앙각은 수축을 형성한다. 심도는 이 두 기억의 원천들로 부양되고 있다. 회상-이미지(혹은 플래시백)가 아닌, 그것을 촉구해내는 현실적인 환기의 노력, 그리고 그것을 찾고, 선택하고, 전면에 등장하게 하기 위한 과거의 잠재적 지대들의 탐색. p.218-221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것을 보고자 했던 사람들은 이미 죽었고, 살아 있는 사람들은 그와 그들이 바랬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이미 잊었다." 회상은 모든 연장을 상실하고, 더 이상 예언을 했던 사람들이나 악의를 품었던 사람들, 혹은 복수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눈요깃거리조차 되지 않는다. 죽음은 그토록 깊이 침투해 있어, 더 이상 초반의 죽음조차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다. 환기되는 모든 것들은 죽음과 일치하고, 모든 죽음들은 영화에 나타나는 앰버슨 소령의 숭고한 죽음과 조응한다. "그는 자신을 앰버슨 가의 일원으로 알아봐줄지조차 확실치 않은 미지의 지대로 들어갈 준비를 해야함을 알고 있었다." 회상은, 현재가 몸을 감추고 회상이 끼어들 모든 가능성을 제거하면서 다른 곳을 향해 질주하고 있기 때문에 공허 속으로 떨어진다. 그렇지만 웰스는 단순히 과거의 허허로움만을 드러내려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웰스적인 니힐리즘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이와 같은 것이 아니다. 여기서 고정점으로서의 죽음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죽음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 그리고 <시민 케인>에서 이미 나타났던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시간의 시트들에 도달하자마자, 마치 거대한 파도의 출렁거림에 실려가듯 시간은 경첩에서 빠져나가고 우리는 지속적인 위기의 상태와도 같은 시간성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p.224-225
과거의 시트들은 존재한다. 그것은 우리가 회상-이미지를 퍼올리게 되는 지층들이다. 그러나 이 과거의 시트들은 항구적인 현재이자 가장 수축된 지대인 죽음으로 인해서 사용될 수조차 없을 수 있다. 혹은 지층화되지 않은 실체 속에서 부서지고 파열되어 산포됨으로써 더 이상 환기될 수조차 없을 수도 있다. 아마도 이 둘은 다시 조우하리라. 혹은 오로지 수축된 죽음의 지점에서만 보편적인 실체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거은 혼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서로 다른 두 상태, 즉 지속적인 위기로서의 시간과, 더 심오하게는 최초의, 거대한 그리고 끔찍스러운 질료, 보편적인 생성으로서의 시간을 의미한다. 허먼 멜빌의 작품에는 특히 웰스에 예정되어 있기라도 한 듯한 텍스트가 있다. 우리는 끔찍한 노력을 들여 피라미드 한 가운데에서 이 미라의 붕대에서 저 붕대로, 이 지층에서 저 지층으로 옮아간다. 그리고 이 모든 행위는 - "지층화되지 않은 물질"이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닌 한 - 묘실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이다. 이것은 물론 초월적인 요소가 아니라, 내재적인 법정, 즉 지구이며, 우리 각각이 부모로부터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태어난 이 지구의 비-연대기적 질서, 즉 토착성을 말한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죽고, 우리의 태어남을 속죄한다. 일반적으로 웰스의 영화에서 사람들은 엎드려, 이미 신체가 땅 속에 있는 채로, 그리고 질질 끌리면서 혹은 기어오르면서 죽는다. 공존하는 모든 지층들은 교통하고, 진흙으로 이루어진 생명력의 환경 속에 병치되어 있다. 토착민들의 근원적 시간으로서의 대지. 바로 이것이 웰스의 일단의 위대한 인물들이 바라보는 것이다. 축축하고 거무튀튀한 땅에서 죽어가는 <악의 손길>의 주인공, 땅의 구덩이 속에서 죽어가는 <심판>의 주인공, 그러나 이미 죽음에 임박한 앰버슨 소령은 간신히 다음과 같이 중얼거리고 있지 않았는가. "그리고 우리는 대지에서 나왔다.... 그러므로 어쨌든 우리는 대지 안에 존재했었음에 틀림없다." <상하이에서 온 여인>의 수족관 장면과 상어 이야기에서처럼 대지는 자신의 원초적인 괴물들과 협상하기 위해 물 아래로 침몰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맥베스, 무엇보다도 <맥베스>가 그러하다. 바쟁은 바로 이 작품에서 웰스적인 인물들의 요소를 볼 수 있었던 것이다. "이 타르칠한 판지로 된 배경, 짐승의 가죽피를 입고 억세게 매듭진 일종의 나무 십자-창을 흔드는 야만적인 스코틀랜드인들, 안개가 자욱히 스민, 물이 뚝뚝 듣는 이 이상스런 장소들, 안개는 하늘에 별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게끔 자욱하고 문자 그대로 선사시대의 세계를 만들고 있다. 물론 우리 조상들인 골 족이나 켈트 족의 세계가 아니라, 하늘과 땅, 물과 불, 선과 악이 아직 선명하게 분리되지 않았던, 시간과 원죄가 탄생했던 의식의 선사시대 말이다." p.228-230
다양한 층위의 과거는 더 이상 하나의 동일한 인물, 가족, 집단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기억을 구성하는 비-소통하는 장소들과 같은, 아주 다양한 인물들에게로 귀착되는 것이다. 레네는 보편화된 상대성에 도달하게 되고, 이로써 웰스에게는 단지 하나의 방향이었던 것, 즉 과거의 시트들 사이의 결정할 수 없는 양자택일을 구성하는 문제를 끝까지 밀고 가게 된다. 그리고 바로 이를 통해 우리는 레네와 로브-그리예의 대립관계를 이해할 수 있으며, 또 이 두 작가의 공동작업이 갖는 풍요로운 양가성 역시 이해할 수 있개 되는 것 같다. 즉 문제는, 동시적인 현재들을 함축하는 첨점들의 예술이 아닌, 공존하는 과거의 층위들을 설명하거나 발전시키는 기억의 건축술인 것이다. 이 두 경우 모두 중심 혹은 고정점은 사라지지만, 그것은 정반대의 방식을 통해서이다. p.231-232
그러나 문제는 아직 전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레네의 영화 속에서 과거의 시트들이란 과연 무엇인가? 동일한 기억의 여러 층위들, 혹은 다수의 기억들의 지대, 혹은 세계-기억의 구성, 혹은 세계의 시대들의 진열? 여기에서 다양한 양상들을 구별해야 할 것이다. 우선 각 과거의 시트는 하나의 연속체이다. 레네의 트래블링이 유명한 이유는, 국립 도서관의 서가를 따라가면서, 혹은 반 고흐의 각 시기의 그림들 속에 잠기면서, 연속체들 또는 다양한 속도를 갖는 회로들을 정의하거나, 혹은 무엇보다도 이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각각의 연속체는 하나의 유형 속에서 가연적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바로 이것이 수학자들이 "빵장수의 변형"이라 부른 것이다. 정사각형은 그 두 절반이 또 다른 새로운 정사각형을 형성할 직사각형으로 늘려질 수 있으며, 이 때 표면 전체는 각 변형에 따라 재분배된다. 만약 가능한 작은 표면의 지대를 생각해볼 수 잇다면, 이 때 한없이 근접한 두 점은 어떤 변형되는 수에 따라 각각이 절반으로 재분배되면서 서로 분리될 것이다. 각 변형은 "내재적인 시대"를 갖고, 그 때 우리는 다양한 시트들 혹은 시대들의 연속체들의 공존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공존 혹은 변형이 하나의 위상학을 형성한다. 예를 들어 <미국인 삼촌>의 각 인물에 상응하는 서로 다른 단면들 혹은 반 고흐의 다양한 시기들, 즉 그만큼의 지층들이라 할 것들이 그것이다. <지난 해 마리엔바드에서>에서는 두 인물 A와 X, 양자 모두에 속한 하나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때 X는 A와 아주 근접한 시트 상에 위치해 있는 반면, 반대로 A는 X와 거리를 두고 분리되어 있는 다른 시대의 시트상에 자리잡고 있다. 이것은 단지 강조된 기하학적 성격이라고만은 할 수 없다. 그것은 여기에 세 번째 인물이라 할 M이 동일한 연속체의 변형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각각이 어떤 '중도적인 시대'를 갖는 이 서로 다른 종류의 두 연속체가 이제 동일한 것의 변형에 일치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어떤 하나가 자신의 모든 지대 내에서 다른 것의 변형으로 나타나는 <히로시마 내 사랑>과 함께 출현하게 된다. 히로시마-느베르(혹은 <미국인 삼촌>의 인물들 사이에서). 이렇게 세계의 시대, 기억의 시대와 같은 시대의 개념 위에 레네의 영화는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 즉 사건들은 단순히 연속되는 것도, 연대기적 흐름을 갖는 것도 아니며, 어느 과거의 시트에 속하느냐 혹은 어느 시대의 연속체의 속하느냐에 따라 끊임없이 바뀌지만, 실상 이 모든 것은 공존하고 있다. X는 A를 알았나 혹은 알지 못했나? <사랑해 사랑해>에서 리데르는 카트린을 죽였나, 혹은 모든 것은 단순한 사고였나? <뮈리엘>의 편지는, 비록 받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보내지기는 했었나, 그리고 그것은 누구에 의해 씌어졌나? 이것들은 과거의 시트들 사이의 결정 불가능한 양자택일을 보여주는데, 그 변형들은 시대들의 공존이라 할 관점에서 볼 때 엄격히 확률적이다. 모든 것은 우리가 위치해 있는 시트에 달려 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항상 레네와 로브-그리예 사이에서 다시 발견할 수 있는 차이이다. 한 사람이 현재의 첨점들의 불연속성(비약들)을 통해 쟁취하는 것을 다른 이는 과거의 연속된 시트들의 변형을 통해 얻는다. 레네에는 로브-그리예의 '양자'론적인 비결정론과는 아주 다른 통계적 확률주의가 존재한다. p.235-236
세 번째로ㅡ 레네는 사전 준비작업에서 인물의 완벽한 일대기와 이들이 출현하는 공간들, 여정에 대한 세세한 지형도상학, 진정한 의미에서의 다이어그램의 작성에 대해 느끼는 자신의 취향을 결코 숨기려 하지 않는다. <지난 해 마리엔바드에서>조차 레네의 이러한 까다로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개인의 일대기란 이미 각 인물들의 다양한 '시대'들을 결정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나아가 하나의 지도는 하나의 시대, 즉 한 연속체 혹은 과거의 시트에 상응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이어그램은 연속체의 변형들의 집합, 지층들의 퇴적, 혹은 공존하는 시트들의 중첩이다. 지도와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영화의 통합적 부분으로 남게 된다. 지도는 우선은 대상, 장소, 풍경에 대한 묘사들로서 나타난다. 즉 일련의 대상들은 <반 고흐>에서 이미, 그리고 <뮈리엘>과 <미국인 삼촌>에서도 마찬가지로 증인의 구실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대상들은 무엇보다도 기능적인데, 레네에게서 기능이란 단순히 대상의 용법이 아니라 대상에 상응하는 정신적 기능 혹은 사유의 층위이다. 즉 "레네는 영화를, 현실을 재현하는 도구로서가 아니라 심리적 기능성에 접근하기 위한 최상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반 고흐>에서 그려진 대상들은 이미 화가의 '내면세계'를 드러내는 기능을 하는 실제 대상처럼 다루어진다. 그리고 <밤과 안개>가 그토록 비통함을 간직하고 있다면, 그것은 레네가 사물들과 희생자들을 통해 단순히 유태인 수용소의 기능만이 아니라, 그 조직을 지배하는, 거의 이해할 수조차 없는 차갑고 악마적인 정신적 기능들을 드러내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국립 도서관의 책들, 책 수레, 서가, 층계, 엘리베이터와 복도들은 거대한 기억의 요소들과 층위들을 구성하고, 인간 자신은 여기서 이 거대한 기억의 정신적인 기능, 혹은 "뉴런적인 메신저"일 뿐이다. 이러한 기능주의에 의해서 지도 지형학은 본질적으로 정신적이고, 두뇌적이라 할 수 있으며, 레네도 자신이 흥미를 갖는 것은 세계, 기억, '세계의 기억'으로서의 뇌, 뇌라고 항상 말한다. 이렇게 가장 구체적인 방식으로 레네는 영화에 다가갔고, 사유라는 단 하나의 인물로 구성된 영화를 창조했다. 이런 의미에서 각각의 지도는 기능의 배분이 대상의 재배치와 일치되는 정신적 연속체, 즉 과거의 시트라 할 수 있다. 레네의 지도지형학적 방법, 그리고 지도들의 공존의 방식은 로브-그리예의 사진의 방식, 그리고 동시적인 스냅 사진적인 방식과 구별된다. 이 두 방식이 공동의 작품을 생산하기에 이를 때조차 말이다. 레네의 다이어그램은, 예를 들어 아우슈비츠의 중첩된 시대들처럼, 기능들의 재분배와 대상들의 파편화와 더불어 한 시트에서 다른 시트로 변형되는 집합을 한정하는 지도들의 중첩이라 할 것이다. <미국인 삼촌>은 지도들이 한 인물, 그리고 한 인물에서 다른 인물을 따라 중첩되고 변형되는 다이어그램적인 정신적 지도지형학의 위대한 시도라 할 수 있다. p.238-239
그러나 레네의 경우, 플래시백의 이러한 불충분성은 현재라는 시간이 더 이상 환기의 중심으로서조차 개입할 수 없는, 과거의 시트들이 공존성 위에 그의 전 작품이 근거하도록 한 것이다. p.240
"레네에게서 나타나는 유년기, 사춘기, 장년기의 연속성의 부재야말로 (...) 어쩌면 출생 혹은 자궁내 시기로부터 죽음과 죽음의 선경험 이르기까지의 생명의 종합적인 순환과정을 창조적 층위에서 재구성하게 하는 것 같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 동일 인물 내네 이 모든 것이 융합된느 경우까지를 포함해서 말이다." 예술작품은 방해되지 않는 한, 그리고 사화된 파편화 속에서 고갈된 시트 상에 고정되어 있지 않는 한, 공존하는 시대들을 통과한다(<조상들오 또한 죽는다>). 반 고흐 같은 예술가가 기억 혹은 세계의 시대들을 변형시킬 이러한 과잉에 도달할 때 그 성공은 성취된다 할 것이다. 이것은 '자기장적magnetique' 조작과도 같은 것으로서, 이 조작은 몽타주를 통해 설명되기보다는 오히려 '몽타주'를 설명한다.
그러나 과거 속에 침윤된 작가란 존재하지 않는다. 영화는 현재를 교묘히 피함으로써 과거가 회상으로 퇴락하는 것을 막는다. 각각의 과거의 시트, 각각의 시대는 모든 정신적 기능들을 동시적으로 간청한다. 회상뿐만 아니라 망각, 오인된 기억, 상상력, 계획, 판단... 매번 모든 기능들을 내포한 것은 감정이다. <인생은 소설이다>는 "사랑이여, 사랑이여"로 시작하고 있다. 바로 감정이 시트 위에 펼쳐져 있고 그 파편화에 따라 어조를 달리하는 것이다. 종종 레네는 흥미로운 것은 인물이 아니라, 그들이 위치한 과거의 지대를 다라서 마치 그들의 그림자처럼 추출될 수 있는 감정들이라고 말하곤 했다. 인물들은 현재에 있지만, 감정은 과거 속에 잠겨 있다. 감정들은 해가 나지 않은 공원에 그려진 그림자(<지난 해 마리엔바드에서>)처럼 인물들이 되어버린다. 음악 또한 여기서 아주 커다란 중요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레네는 인물들의 심리학을 고려하느냐, 혹은 순수한 감정의 심리학을 고려하느냐 하는 기준에 따라, 심리학을 넘어섰다고도, 혹은 심리학적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변형들이 그 자체로 모든 다른 것들을 통과하는 하나의 시트를 형성할 때에는, 마치 감정은 그것으로 충만한 의식 혹은 사유를 풀어놓는 듯하다. 그림자들이 정신적인 무대의 살아 있는 현실성, 감정들, 아주 구체적인 '뇌의 유희'의 진정한 형상이 되는 의식화처럼, 이것은 사유가 그 자신에 스스로를 드러내는 최면과도 같다. 동일한 움직임 속에서 레네는 인물을 넘어 감정으로, 감정을 넘어 이것들이 인물이 되는 사유로 지향해간다. 바로 이런 이유로, 레네는 뇌에서 일어나는 것, 괴물 같고 혼돈스런, 혹은 창조적인 메커니즘이라 할 뇌의 메커니즘에서 일어나는 것만이 흥미롭다고 거듭 말한다. 감정이 세계의 시대들이라면, 사유는 그것에 상응하는 비-연대기적 시간이다. 감정이 과거의 시트라면, 사유, 뇌는 이 모든 시트들 사이에 존재하는 국지화할 수 없는 관계의 집합, 이 시트들을 마치 배엽처럼 감고 펼치면서 죽어 있는 위치에 멈추거나 고정되기를 막는 연속성이다. 소설가 비엘리에 따르면, "우리는 감추어진 은밀한 힘들의 세밀한 작용에 종속된 영화 필름의 펼쳐짐과도 같다. 이 필름이 멈추기를,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공포의 인위적인 포즈 속에서 고정되기를." 영화에서는 무엇인가가 "이미지 주위에, 혹은 이미지 뒤에서, 그리고 이미지 내면에서까지" 일어나고 있음에 틀림없다고 레네는 말한다. 이것은 이미지가 시간-이미지가 될 때 일어나는 일이다. 세계는 기억, 뇌, 시대들 혹은 배엽들의 중첩이 되었지만, 그러나 뇌 자신은 의식, 시대들의 연속화, 항상 새로운 배엽들의 창조 혹은 싹틈, 스티롤렌과 같은 물질의 재창조가 되었다. 스크린은 그 자체, 어떤 할당된 거리도 없이, 모든 고정점에서 독립하여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과거와 미래, 내부와 외부가 대면하는 뇌막과 같은 것이다. 이미지는 이제 더 이상 공간과 운동이 아니라 위상학과 시간을 그 우선적인 특성으로 갖게 된 것이다. p.242-244
세 번째 논점은 더 이상 묘사의 문제가 아니라 서사의 문제이다. 유기적인 서사는 인물들이 상황에 반응하거나 상황을 드러내면서 행동하는 감각-운동적 구조의 발전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에서 이 서사는 허구에서조차 진실임을 주장하는 진리언표적인 서사라 할 수 있다. 이 체제는 단절(생략), 회상과 꿈의 삽입 등이 개입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발전의 요소로서 말의 어떤 특정한 용법을 함축하기 때문에 복잡한 구도를 갖는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 이 요소의 특이성이 무엇인가를 고찰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단지 감각-운동적 구조란 힘과 이 힘들 사이의 대립, 긴장, 그리고 목표, 장애물, 수단, 우회 등의 배분에 따른 긴장의 이완들로 이루어진 장에 의해 정의되는 "경로적 공간espace hodologique" (쿠르트 레빈) 내에서 구체적으로 펼쳐진다는 것만을 확인해두고자 한다. 이에 상응하는 추상적 형태는 유클리드 공간으로서, 그것은 유클리드 공간이란 긴장들이 최소값과 최대값 같은 소위 극치의 법칙에 따른 경제원칙에 입각하여 해소되는 환경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가장 단순한 길, 가장 적절한 우회, 가장 효율적인 말, 최대의 효과를 위한 최소의 수단과 같은 것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이 서사의 경제성은 행동-이미지와 경로적 공간의 구체적인 형상, 그리고 운동-이미지와 유클리드 공간이라는 추상적 형상 속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운동과 행동은 수많은 가시적인 비정상성들, 즉 단절, 삽입, 중첩, 해체 등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것들은 공간 내에서의 힘의 중심들의 배분으로 귀결되는 법칙들에 순응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시간이 행동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운동에 의존하며 공간으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는 한, 시간은 간접적인 재현의 대상일 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어떻게 전복되든 시간은 여기서 원칙적으로 연대기적 시간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결정체적 서사는 이와는 전혀 다른 것인데, 그것은 이 서사가 감각-운동적 구조의 붕괴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각-운동적 상황은 견자가 된 인물들이 더 이상 반응을 할 수도, 반응하기를 원하지도 않는 순수한 시지각적, 음향적 상황으로 대체되었고, 그런 만큼 여기서 인물들은 상황 내에 존재하는 것을 '바라보아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구로사와가 다시 취할 도스토예프스키적인 조건이다. 즉 가장 위급한 상황에서 <백치>는 이 상황보다도 더 심오하고 훨씬 더 위급한 어떤 문제의 소여들을 보고자하는 욕구를 느끼는 것이다(구로사와의 대부분의 영화에서처럼). 그렇지만 오즈와 네오리얼리즘, 누벨 바그에서도 시각은 더 이상 행동에 부가된 전제 사항이거나, 조건처럼 전개되는 선결사항이 아니라, 모든 위치를 점령하고 행동을 대체해버린다. 이 때 운동은 제로점을 지향할 수도 있고, 또 인물 혹은 쇼트도 그 자체로 고정되어버릴 수 있다. 고정 쇼트는 이렇게 재발견된다.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운동 또한 그 자신 과장되거나 끊입없이 지속되거나 세계의 운동, 브라운 운동, 답보, 교차, 다양한 층위의 운동의 증식 등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운동의 비정상성이 더 이상 우연적이거나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이 되었다는 것이다. 드레이어가 정초한 것과 같은 거짓 매치가 지배적이게 된 것이다. 이것은 결정체적인 서사가 체험된 경로적 공간과 재현된 유클리드적 공간의 상보성을 깨뜨리게 될 것임을 말하는 것과 같다. 감각-운동적 접속을 상실해버린 구체적 공간은 긴장과 긴장의 해소, 목표와 장애, 수단과 우회와 같은 것에 의해 구성되기를 그친다. 영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영화에서 폭넓게 추인될 다음과 같은 관점에 의거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경로적 공간 이전에는 원근법의 중첩이 존재하며 바로 이것이 이미 결정된 장애물의 포착을 방해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여기에 단일한 집합을 조직화할 차원들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결단적인 행동에 앞선 마음의 동요란 여러개의 대상 혹은 여러 갈래의 방향 사이에서의 주저, 망설임이 아니라 거의 유사한, 그러나 이질적인, 그래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집합들의 유동적인 겹침이다." 바로 여기에서 결정체적 서사는 행동의 위기를 통해 결정체적 묘사와 이것의 반복과 변주를 지속하게 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공간이 경로적이지 않게 됨과 동시에, 추상적 공간은 이제 모든 합법적인 접속과 그것을 조정하는 극치의 법칙을 상실함으로써 더 이상 유클리드적이지 않게 된다. 물론 우리는 과학적인 결정인들을 그 고유영역 바깥으로 소환할 때 가질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다. 자의적 은유의 위험 혹은 끔찍스런 응용의 위험이 그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과학적인 조작자로부터 그 자체 비과학적인 영역에 귀속되는, 그리고 단순한 응용이나 은유가 아니라 과학과 더불어 수렴될 수 있는 어떤 개념화할 수 있는 특성을 추출해내는 데 그친다면 이러한 위험은 아마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런 의미로 우리는 브레송, 네오리얼리즘, 누벨 바그, 그리고 뉴욕파에서 볼 수 있는 리만적 공간, 로브-그리예의 양자적 공간, 레네의 확률과 위상학적 공간, 헤어조크와 타르코프스키의 결정화된 공간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부분들의 연결이 사전에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때 우리는 리만 공간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순수하게 시지각적이고 음향적인 혹은 촉각적이기조차 한(브레송의 방식으로) 탈접속된 공간이다. 또한 오즈나 안토니오니에게서 볼 수 있는, 유클리드적 좌표를 상실한 텅 비고 형태가 없는 공간이 있다. 그리고 풍경이, 결정체적인 배아와 결정화될 수 있는 질료만을 보유한 환경에서 환각적이게 되어버린 결정화된 공간들이 있다.
그러나 이 공간들을 특징짓는 것은, 이들의 성격이 단지 공간적인 방식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는 데 있다. 이 공간들은 국지화될 수 없는 관계들을 함축한다. 그것이 바로 시간의 직접적인 현시이다. 우리는 더 이상 운동으로부터 유출되는 시간의 간접적 이미지를 갖는 것이 아니라, 운동 자신이 그로부터 유출되는 직접적인 시간-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이다. 더 이상 우연적인 비정상적 운동에 의해 전복될 수 있는 연대기적 시간이 아닌, 필연적으로 '비정상적'이고 본질적으로 '거짓인' 운동을 생산하는 만성적인, 비-연대기적인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다. 또한 몽타주는, 깊이를 갖건 그렇지 않건, 플랑-세캉스에 자리를 내주고 사라지려 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이 말은 사실이 아니다. 몽타주는 여전히 가장 빈번하게 영화의 본질적인 행위로 남아 있다. 단지 그 의미가 변했을 뿐이다. 몽타주는 시간의 간접적 이미지가 유출될 수 있도록 운동-이미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모든 운동들이 유출되도록 직접적인 시간-이미지 속에서 모든 관계들을 해체한다. 이 시간적 관계들을 결정하는 것은 회상도 꿈도 아니다. 회상-이미지 혹은 꿈은 감각-운동적 구조 내에서는 현실화 과정에 있는 것이며, 이 구조의 확장 혹은 쇠퇴를 전제하지만, 이것은 전혀 다른 어떤 것을 위한 단절을 전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시간이 직접적으로 출현하게 된다면, 그것은 탈현실화된 현재의 첨점들, 잠재적인 과거의 시트들 속에서이다. 시간의 간접적인 이미지는 감각-운동적 상황에 따른 유기적인 체제 속에서 구성되지만, 두 직접적인 시간-이미지는 순수한 시지각적, 음향적 상황에 따른 결정체적 체제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서 더 복잡한 혹은 더 보편적인 네 번째 논점이 나오게 된다. 사유의 역사를 고찰해볼 때, 시간이란 항상 진리의 개념을 위기에 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진리가 시대에 따라 변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단순히 경험적인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닌, 진리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시간의 순수한 형태, 혹은 오히려 시간의 순수한 힘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위기는 이미 고대에 '우발적인 미래들'의 역설이라는 것에서 폭발되었던 것이다. 만약 해전이 내일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참이라면 어떻게 다음과 같은 두 결과 중의 하나, 즉 불가능이 가능을 행한다는 것(왜냐하면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할 수 없기 때문이다)을, 혹은 과거란 필연적으로 참인 것은 아니라는 것(왜냐하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이다)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역설을 소피스트적인 궤변으로 치부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렇지만 이것은 또한 진리와 시간의 형태의 직접적인 관계를 사유할 때의 어려움을 드러내며, 진실을 실존하는 것으로부터 멀리 가두어버리도록, 즉 영원한 것 혹은 영원한 것을 모방한 어떤 것 속에 진실을 가두어버리도록 강요한다. 이 역설에 대한 가장 교묘한, 그리고 동시에 가장 이상스럽고 뒤틀린 해법을 얻기 위해서는 라이프니츠를 기다려야만 할 것이다.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해전은 일어날 수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동일한 세계 내에서는 아니다. 해전은 어떤 한 세계에서는 일어나지만, 또 다른 세계에서는 일어나지 않으며, 이 두 세계는 모두 가능하지만, '함께 가능하지는' 않다. 라이프니츠는 그렇게 진리를 구하면서 역설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가능하지 않음(모순의 개념과는 아주 다른)이라는 멋진 개념을 만들어내야만 했다. 그에 따르면 가능을 행하는 것은 불가능성이 아니라 단지 함께 가능하지 않음이다. 그래서 과거는 필연적으로 참이 되지 않고서도 참일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진리의 위기는 해결이라기보다는 휴지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왜냐하면 어떤 것도 우리로 하여금 함께 가능하지 않은 것이 동일한 세계에 속하고, 함께 가능하지 않은 세계들이 동일한 우주에 속한다는 것을 부인하게 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팽이라는 사람이 어떤 비밀 하나를 간직하고 있다고 하자. 한 미지의 인물이 그의 방문을 두드린다. 팽은 침입자를 죽일 수도 있고 침입자가 팽을 죽일 수도 있으며, 혹은 둘 다 구출되거나 둘 다 죽을 수도 있다, 등등.... 당신은 내 집에 도착합니다. 가능한 어떤 과거 속에서 당신은 내 적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과거 속에서는 내 친구일 수도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라이프니츠에 대한 보르헤스의 답변이다. 즉 시간의 힘, 시간의 미로로서의 직선은 또한 두 갈래로 갈라지는 선, 함께 가능하지 않은 현재들을 통해 가면서, 그리고 비-필연적으로 참인 과거로 되돌아오면서 끊임없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선인 것이다.
이로부터 서사의 새로운 위상이 나오게 된다. 서사는 진리언표적이기를 그치고, 다시 말하면 참임을 주장하기를 그치고 본질적으로 거짓을 만들어내는 것이 된다. 이것은 '모든 것은 각자 진실이다' 라는, 내용과 관련된 다양한 변주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것은 함께 가능하지 않은 현재들의 동시성, 혹은 비-필연적으로 참인 과거들의 공존성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참의 형태를 대체하고 실각시키는 거짓의 역량이다. 결정체적 묘사는 이미 실재적인 것과 상상적인 것의 식별 불가능성에 도달했지만, 이에 상응하는 거짓을 만들어내는 서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현재에서 참과 거짓 사이의 설명 불가능한 차이의 문제를, 또 과거에서 이들 사이에 결정할 수 없는 양자택일의 문제를 제기한다. p.257-264
서사는 더 이상 실제적인(감각-운동적인) 묘사와 연쇄되는 진리언표적인 서사라 할 수 없다. 묘사가 자신의 고유한 대상이 됨과 동시에, 서사는 시간적이고 거짓을 만들어내는 것이 된다. 결정체의 형성 시간의 힘, 그리고 거짓의 역량은 엄격히 상보적이며, 새로운 이미지의 좌표로서 끊임없이 서로를 함축한다. 여기에는 여하한 의미로서의 어떤 가치 판단도 존재하지 않는데, 그것은 이 새로운 체제 또한 과거의 체제만큼이나 이미 만들어진 기존의 공식들, 비법들, 공교하고 허황된 적용, 실패, 자의성, 걸작으로 소개되고는 하는 '중고품'들을 생산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무엇보다도 아주 다양한 거장들에게 영감을 준 새로운 유형의 묘사-서사, 즉 이미지의 새로운 위상이다. p.265-266
진리언표적인 서사는 공간에서의 합법적인 접속, 그리고 시간에서의 연대기적 관계를 따라 유기적으로 발전된다. 물론 저곳은 이곳과, 옛것은 현재와 인접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소와 시간의 이러한 변주 가능성은 관계와 접속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항들 혹은 요소들을 결정함으로써, 결국 서사는 앙케이트나 이 앙케이트를 참에 귀속시킬 증거들을 함축하게 된다. 조사자, 증인들은 순수한 '소송' 영화에서처럼 명백히 자율적인 형상을 취할 수도 있다. 그러나 명시적이건 그렇지 않건, 항상 서사가 되돌아가는 것은 판단체계이다.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거나, 죄인이 운명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경우라 할지라도 말이다. 그와는 반대로 거짓을 만들어내는 서사란 이 체계로부터 빠져나가 판단체계를 부수는데, 이는 거짓(오류나 의혹이 아닌)의 역량이 죄인으로 추정된 사람분만 아니라 조사자와 증인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스타비스키>의 증언들은 이를 부인하는 인물의 생생함 그 자체로부터 나타난다. 이어 이 증언들 내에서 이미 어떤 죽은 사람에 대해 말하고 있는 또 다른 증인들이 출현한다." 이것은 요소들 그 자체가 그들이 관계하는 시간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며, 각 항들 또한 자신의 접속들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사 전체가 그 각각의 에피소드에서 주관적인 변주에 의해서가 아닌, 탈접속된 공간과 탈연대기화된 순간들을 따라 전체적으로 끊임없이 변모하는 것이다. 이 새로운 상황에는 더 심오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단일화하고 인물의 동일화(자신의 발견 혹은 단순히 자신의 일관성)를 지향하는 진실의 형태와는 반대로, 거짓의 역량은 환원될 수 없는 다수성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아=자아의 동일성을 "나는 타자이다'가 대체해버린 것이다.
거짓의 역량은 끊임없이 서로에게로 되돌려지고 서로를 통과해가는 일련의 역량들의 양상 하에서만 존재한다. 그래서 결국 조사자들, 증인들, 무죄한 혹은 죄를 범한 주인공들은 동일한 거짓의 역량에 참여하여 서사의 각 단계에서 그 역량의 정도들을 구현할 것이다. 니체는 "진리언표적인 인간조차 결국은 끊임없이 자신이 거짓말해왔음을 알게 된다"고 말한다. 거짓을 만들어내는 자는 그러므로 자신이 변형되어가는 일련의 거짓을 만들어내는 자들의 사슬과 분리될 수 없을 것이다. 유일한 거짓을 만들어내는 자들의 사슬과 분리될 수 없을 것이다. 유일한 거짓을 만들어내는 자란 존재하지 않으며, 그래서 만약 그가 무엇인가를 폭로한다면 그것은 자신 뒤에 있는 또 다른 거짓을 만들어내는 자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일 것이고, 이것은 심지어는 <스타비스키>나 <위대한 사기꾼>에 나오는 재정적 전략을 꾀하는 국가일 수조차 있다. 예술가가 이 사슬의 한 끝, 무한대의 거짓의 역량에 속한다면, 진리언표적인 인간은 그 정반대의 다른 끝에 속하게 될것이다. 그리고 서사는 이 거짓을 만들어내는 자들의 진열, 한 편에서 다른 편으로의 이들의 미끄러짐, 그리고 그들 서로의 변형만을 내용으로 갖게 될 것이다. 문학과 철학에서 이러한 거짓을 만들어내는 자들의 사슬 혹은 이러한 일련의 역량들을 발전시켰던 위대한 두 텍스트가 있다면, 그것은 니체의 [차라투스트라]의 마지막 권, 그리고 멜빌의 소설 <위대한 사기꾼>이라 할 것이다. 전자는 점쟁이, 두 왕, 거머리 인간, 마술사, 최후의 교황, 가장 혐오스러운 인간, 자발적인 걸인과 그의 그림자 등을 통과해가는 초인의 '다수적 외침'을 보여준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벙어리 흰둥이, 앉은뱅이 검둥이, 상중의 남자, 회색 옷을 입은 남자, 모자를 쓴 남자, 회계장부를 든 남자, 약초 박사, 그리고 알록달록한 옷을 입은 세계주의자, 위대한 최면술사, '형이상학적 두꺼비'에 이르기까지, 각각이 다른 것으로 변모하고 이들 모두가 결국은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거짓일 뿐인 '진리언표적 인간'에 대항하는, 일련의 거짓을 만들어내는 자들을 보여준다. 고다르는 시네마-베리테의 대표자, 경찰, 위대한 사기꾼 그 자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가, 셰샤 모자를 쓴 예술가의 초상에 이르는 인물들의 계열을 스케치한다. <지난 해 마리엔바드에서>에서 최면에 걸린 듯한 인물(진리언표적 여인?)은 최면술사와 관계되는데, 이것은 그 뒤편에서 또 다른 최면술사를 드러낸다는 조건 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혹은 어떤 점에서는 모두가 거짓을 만들어내는 자들인 <뮈리엘>의 계열을 보라, 로브-그리예의 계열들은 <유럽 횡단 급행열차>의 양태로 전개된다. p.267-270
언어학적 영감에 기댄 기호학, 기호비판론은 '서사장애'에 대한 풍요롭고 다각적인 연구 속에서 거짓을 만들어내는 서사의 문제와 맞닥뜨리게 되엇다. 그러나 기호학은 영화적 이미지와 언표를 동일시하고 시퀀스 전체를 일반적인 서사와 동일시함으로써, 서사들 간의 차이란 이미지의 잠재적인 지적 구조를 구성하는 언어적 사행으로부터만 유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 구조를 결정하는 것은 서로 상보적인 통합체와 계열체로서, 이들의 상보성은, 전통적 서사에서 통합체만이 결정적이었고 계열체는 미약하고 별로 규정적이지 않았던 조건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크리스티앙 메츠). 이로써, 통합체의 우월성에 기댄 전통적 서사가 그 중첩적이고 등질적이며 동일시 가능한 성격을 잃어버리려면 구조적 질서에서 계열체가 본질적이 되거나 혹은 구조가 '계열적'이 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겨졌던 것이다. '거대통합체'는 그 용량이 초과되었고, 이를 비유적으로 표상했던 그랑 드무아젤은 죽거나 파괴되어, 미시적 요인들이 이를 내부로부터 파괴하거나 증식시키게 된다. 또 다른 새로운 통합체들이 출현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예를 들어 샤토와 조스트의 '투사적 통합체'와 같은), 이것은 바로 우선권의 변화를 증언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영화는 항상 서사적이었고 점점 더 서사화되어가고 있지만, 그 세목에서는 새로운 구조에 의해서 설명되는 반복과 전치, 변형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서사장애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순수한 기호론은 기호학의 이러한 방향을 따를 수 없다. 그것은 이미지의 '소여'라 할 수 있을 서사(묘사 또한)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서사의 다양성은 기표의 부침이나, 일반적으로 이미지에 잠재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언어적 구조의 상태에 의해서는 설명될 수 없다. 서사의 다양성이란, 어떤 서사도 전제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그로부터 어떤 특정한 서사가 흘러나오도록 하는 이미지의 감각적 형식, 그리고 그에 조응하는 감각적 기호들로 귀착되는 문제이다. 감각적 유형들은 언어적 사행에 의해 대체되지 않는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거짓을 만들어내는 서사는 직접적으로 시간 이미지, 즉 시지각기호와 시간기호에 의존하는 반면, 전통적 서사는 운동-이미지의 형식과 감각-운동적 기호로 환원된다고 할 수 있다. p.272-274
웰스에게는 니체의 진리 비판의 주요 논점들을 다시 점검해 가고 있기라도 하는 듯한, 웰스적인 니체주의라고 할 만한 것이 존재한다. '진실인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접근할 수 없고 환기할 수 없는 것이며, 만약 이 세계를 환기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용하거나 잉여적인 것일 것이다. 진실인 세계는 '진리언표적인 인간', 즉 진리를 원하는 인간을 전제하지만, 그 사람은 마치 자신의 내면에 또 다른 인간을 감추고 있기라도 하는 양, 이상한 동기들, 예를 들면 복수심 같은 것을 품고 있다. 오델로는 진리를 원하지만 그것은 질투심에 의해서이고, 혹은 더 나쁘게는 자신이 흑인인 것에 대한 복수심에 의해서이며, 진리언표적인 인간 그 자체라 할 바거스는 오직 문서 보관소에서 자신의 적에 대한 증거들을 수집하는 데 몰두하여 오랫동안 아내의 운명에 무관심한 것처럼 보인다. 결국 진리언표적인 인간은 삶을 심판하고자 하는 것 이외의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는 더 상위의 가치, 즉 선을 기치로 세우고 바로 이 선의 이름으로 심판할 수 있고자 하며 심판을 내리고자 갈급해 있고, 삶에서 악, 즉 속죄해야 할 과오만을 본다. 이것이 바로 진리 개념이 갖는 도덕적 기원이다. 니체처럼 웰스는 끊임없이 판단체계에 대항하여 투쟁하였다. 삶보다 상위의 가치란 존재하지 않으며, 삶은 판단되거나 정당화될 필요가 없는 무구한 것이고 서과 악의 경계를 넘어 "생성의 무구함"을 갖고 있는 것이다.... p.275-276
랑에게서나 프레밍거에게 의문시된 것은 심판한다는 것의 가능성 그 자체이다. 랑에게는 더 이상 진리가 아닌 그 외양만이 존재할 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시절의 랑은 가장 뛰어난 외양의 시네아스트, 혹은 거짓이미지의 시네아스트로 태어난다. 모든 것은 외양이지만, 이 새로운 상태는 판단 체계를 폐지한다기보다는 변형시킨다. 실상 외양이란 스스로를 기만하는 것이다. 랑의 영화에서 뒤어난 순간들은 한 인물이 자신을 기만할 때이다. 외양은 스스로를 배반하는데, 이는 외양이 더 심오한 진리로 대체되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그 자신 스스로를 진실-아님으로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인물은 실수를 하거나 희생자의 이름을 알고 있거나(<진실임직하지 않은 진리>) 혹은 독일어를 안다(<사형집행인 또한 죽는다>). 이런 조건 속에서 새로운 외양들이 출현하여 이 외양들과의 관계를 통해 첫 번째 외양들이 심판 받을 수 있고 또 심판될 가능성이 남게 된다. 예를 들어 레지스탕스들은 거짓 증인들을 사주하여 게슈타포가 독일어를 알고 있는 배신자를 처단하도록 할 것이다. 판단체계는 이로써 커다란 변모를 겪게 되는데, 그것은 이 체계가 외양들이 의존하는 관계를 결정하는 조건들로 선회하기 때문이다. 랑은 이렇게 일종의 프로타고라스적인 상대주의를 창안했고, 이 프로타고라스적 상대주의에서 판단은 '최상의' 관점, 즉 외양들이 한 개인 혹은 최상의 가치를 갖는 휴머니즘을 위해 전복될 기회를 갖게 되는 관계를 표현한다('복수' 혹은 외양의 전치로서의 판단).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는 랑과 브레히트의 만남, 그리고 이 만남이 드러낸 오해들을 이해하게 된다. 왜냐하면 브레히트와 마찬가지로 랑에게도 판단이란 더 이상 직접적으로 이미지 내에서 행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 그 자체를 판단할 가능성의 조건들이 주어져 있는 관객의 편으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브레히트에게서 모순들의 현실에 기반하고 있는 것들이, 랑에게서는 반대로 외양들의 상대성에 기반하고 있다. 전자뿐만 아니라 후자에서도 판단체계는 위기를 겪게 되지만, 이 체계는 또한 구원되고 변형된다. 웰스에게서 이것은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비록 인물이 스스로를 기만하는 <이방인>이라는 '랑 스타일적인', 그러나 이후 포기해버린 영화 한편을 만들기는 했지만 말이다). 웰스에게 판단체계는 결정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서, 그것은 심지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객에게 그러하다. <상하이에서 온 여인>에 등장하는 판사의 사무실의 황폐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심판>에서 볼 수 있는 재판의 끝없는 협잡은 이 새로운 불가능성을 증언할 것이다. 웰스는 판단 내릴 수 없는, 그리고 판단되어야 할 필요가 없으며 모든 가능한 판단으로부터 빠져나가는 인물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낸다. 만약 진리의 이상이 붕괴한다면, 외양의 관계는 더 이상 판단 가능성을 지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니체의 말을 따르자면 "참인 세계를 폐기함과 동시에 우리는 또한 외양의 세계를 폐기해버렸던 것이다...." p.276-278
만약 힘들의 관계가 양적인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어떤 '특질'들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한다면 그렇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획일적이고 변주되지 않는 단일한 방식을 통해서만 다른 힘들에 반응할 수 있는 힘들이 있다. <아카딘 씨>의 전갈은 오로지 물 줄밖에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익사해 죽는다 할지라도 자신을 물 위로 데려가는 개구리를 물어버린다. 그러므로 변주 가능성은 힘들의 관계 속에서 살아남는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전갈의 무는 행위가 개구리에게로 향할 경우, 이 행위는 결국 다시 그 자신에게로 되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힘이 변용하거나 힘 자신을 변용시킬 수 있는 것이 갖는 변주가능성에 의거해 봤을 대, 전갈이란 그 자체 스스로는 더 이상 변형될 수 없는 힘의 유형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예를 들어 배니스터는 물 줄밖에 모르는 거대한 전갈이다. 아카딘은 죽일 줄밖에 모르며, 퀸란은 증거들을 날조할 줄밖에 모른다. 이것은 비록 그 힘이 아직 양적으로는 아주 거대하게 남아 있다 할지라도 이미 고갈되어버린 힘의 유형으로서, 이 힘은 스스로를 파괴하기 전, 그리고 어쩌면 스스로 자멸하기 위해, 파괴하고 죽일 수밖에 없다. 바로 여기에서 힘은 하나의 중심, 그러나 죽음과 일치되는 중심을 되찾게 된다. 비록 거대한 힘이라 할지라도 이 힘은 더 이상 변형될 줄 모르기 때문에 고갈된 것이다. 그래서 이 힘은 또한 추락하는 힘이며 데카당트하고 퇴폐적이다. 그것은 신체의 불능 상태, 즉 '힘의 의지'가 단지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 죽음을 위한 존재,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갈망하는 존재일 뿐인 그 정확한 지점을 표상하고 있다. 웰스는 이 전능한 불구자들의 도표를 한없이 증식시킨다. 배니스터와 보철물들, 퀸란과 지팡이, 아카딘과 비행기가 없을 때 느끼는 그의 당혹감, 그리고 성적 불구자 그 자체인 이아고. 이들은 모두 복수심의 인간들이다. 그렇지만 더 상위의 가치라는 명목으로 삶을 심판하고자하는 진리언표적인 인간과는 다른 방식으로 말이다. 반대로 이들은 스스로가 더 우월한 인간들이라고 생각하며,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권한으로 삶을 심판하고자 하는 상위의 인간들이다. 그러나 이것은 서로 다른 두 형상을 갖는 동일한 복수심의 정신은 아닌가? p.279-280
초월적인 가치로서의 판단이 아닌, 내재적인 평가로서의 정서가 문제인 것이다. 즉 '나는 판단한다' 대신 '나는 사랑한다 혹은 증오한다'. 이미 판단을 정서로 대체시켜버렸던 니체는 독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하였다. '선과 악을 넘어'는 그러나 좋음과 나쁨을 넘어를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이 나쁨이 바로 고갈되고 퇴락한 삶,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끔찍한 삶, 또한 빠르게 번식되는 삶이다. 반면에 좋음이란 분출하고 상승하는 삶, 자신이 만나는 다른 힘들에 따라 변형되고 변모할 줄 아는 삶, 그리고 이 힘들과 함께 끊임없이 살고자 하는 역량을 배가시키고 새로운 '가능성들'을 열면서 더 큰 역량을 구성하는 삶이다. 물론 그 어느 것에도 진리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생성만이 있을 뿐이고, 생성이란 삶이 갖는 거짓의 역량이며 힘의 의지이다. 그렇지만, 좋음과 나쁨, 즉 고귀한 것과 천한 것이 존재한다. 물리학자들에 따르면 고귀한 에너지란 스스로 변형될 수 있는 에너지를 말하며, 반면에 천한 에너지는 그것이 더 이상 불가능한 에너지를 말한다. 양면에 모두 힘의 의지가 존재하지만, 후자는 생명이 고갈되어버린 생성에서의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일 분이며, 반면에 전자는 분출하는 생성 속에서의 예술가적 의지 혹은 '증여하는 덕', 즉 새로운 가능성의 창조라 할 수 있다. 소위 상위의 인간은 천하거나 나쁘다. 그러나 좋은 것은 '관대함'이라는 단 하나의 이름만을 가지며, 바로 이러한 특성을 통해 웰스는 자신이 선호했던 인물인 폴스태프를 정의하고 있고, 또 이것이 돈키호테에 대한 그의 영원한 프로젝트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라 가정해볼 수 있다. 만약 생성이 거짓의 역량이라면, 좋음, 관대함, 고상함은 거짓을 한없는 승차로 상승시키는 것, 혹은 예술가 되기에 이르는 힘의 의지라 할 것이다. 폴스태프와 돈키호테는 역사에 뒤떨어진 허풍선이거나 가련한 인간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생의 변형에 대한 전문가들로서, 이들은 역사에 생성을 대립시킨다. 모든 판단과 어떤 공통분모도 갖지 않은 공약 불가능한 이들은 생성의 무구함을 소지하고 있다. 그리고 어쩌면 생성이란 범죄에서조차, 혹은 그것이 여전히 생성이기만 하다면 지쳐 고갈된 삶에서조차 항상 무구함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단지 좋음만이 삶으로부터 부활하는 것, 변형하고 창조하는 것에 항상 헌신하면서, 삶을 탕진하기보다는 삶에 의해 스스로 탕진된다. 그것은 단일하고 고정된 존재의 높이로부터 비-존재로 생성을 굴러 떨어뜨리는 대신, 생성을 무수한 변화무쌍한 형태를 갖는 존재로 만든다. 이것은 삶을 심판하거나 혹은 길들이기 위해, 그리고 온갖 수단으로 삶을 고갈시키기 위해 스스로 생성보다 상위임을 주장하는 하나의 심급이 아닌, 내재적인 생성 안에서 서로 대립되는 생명의 두 상태라 할 수 있다. 웰스가 폴스태프와 돈키호테에게서 본 것은 삶 그자체로서의 '선량함'. 살아 있는 것을 창조로 이끌어가는 이상한 선량함이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웰스의 독창적인 혹은 자발적인 니체주의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이 생성 속에서 대지는 그 자체로 중심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공전할 수 있는 중심을 갖고 있지도 않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신체는 다 소진됐을 때의 죽음이라는 중심 이외에는 더 이상 어떠한 중심도 갖지 않고, 대지와 조우하면서 해체된다. 정확히 말해 힘은 다른 힘들과의 관계로부터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중심도 갖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디디에 골드슈미트의 말처럼, 짧은 쇼트들은 끊임없이 왼쪽으로 혹은 오른쪽으로 흔들리며, 마찬가지로 플랑-세캉스는 수없이 뒤죽박죽이 된 명멸해가는 중심들을 촉발한다(<악의 손길>의 시작에서처럼). 무게 또한 자신들이 재분배될 무게 중심을 잃어버렸고, 덩어리들은 그 주위로 정돈될 중력의 중심을 잃어버렸으며, 힘들은 그 주위로 공간을 조직할 역학적 중심을 잃어버렸고, 운동조차 그들이 펼쳐지게 될 공전의 중심을 잃어버렸다. 바로 여기 웰스에게서 우리는 형이상학적일 뿐만 아니라 영화적이기조차 한 어떤 변동을 목도하게 된다. 그것은 운동이란 진리의 이상에 대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운동은 불변항들, 즉 동체의 중력점, 운동이 통과해가는 특이점들, 운동시 관계하는 고정점을 제시하는 한 여전히 진시에 완벽하게 부합된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운동 이미지는 그 본질 자체에 있어서 운동이 자신의 중심을 보존하는 한, 자신이 소청하는 진리의 효과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연구의 시작에서부터 말하려 했던 것이다. 즉 영화적인 변동은 운동의 일탈이 독립성을 얻을 때, 다시 말하면, 동체와 운동이 불변항들을 상실할 때 발생한다. 이 때 운동은 스스로에게 진실을 요구하기를 그치고 동시에 시간이 운동에 종속되기를 그치는 전복이 일어나게 된다. 즉 이 둘은 동시적으로 산출된다. 근본적으로 탈중심화된 운동은 거짓 운동이 되고, 근본적으로 해방된 시간은 이제 거짓 운동 속에서 실행되는 거짓의 역량이 된다. p.281-284
묘사와 서사를 넘어서는 또 다른 세 번째 심급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야기이다. 유성parlant이라는 요소가 갖는 특별한 중요성을 아직 고려에 넣지 않은 채 이미 우리가 다른 두 심급에 대해 행한 것처럼 임시적으로 이야기를 정의한다면, 이야기란 일반적으로 주체-대상의 관계, 그리고 이 관계의 발전에 대한 것이라 할 것이다(반면에 서사는 감각-운동적 구조의 발전에 대한 것이다). 이 때 진리의 모델은 감각-운동적 접속이 아닌 주체-대상의 '적합성'에서 자신의 풍요로운 표현성을 발견한다. 그렇지만 우선 영화의 조건들에서 주체와 대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관습적으로 우리는 카메라가 '바라보는' 것을 객관적인 것, 인물이 바라보는 것을 주관적이라 지칭한다. 이러한 관습은 영화에만 있는 것으로서 연극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카메라는 그러나 인물 자신을 바라보아야만 한다. 즉 동일한 인물이 때로는 바라보고 또 때로는 바라보여진다. 그러나 또한 동일한 카메라가 보여진 인물과 그가 바라보는 것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야기란 이 두 종류의 이미지들, 즉 주관적인 이미지들과 객관적인 이미지들의 전개, 이 이미지들의 복합적인 관계라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관계는 적대적인 것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그러나 자아=자아라는 동일성의 형태, 즉 보여진 인물과 보는 인물의 동일성뿐만 아니라 인물과 인물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는 카메라-시네아스트의 동일성까지 포함하는 동일성의 형태로 귀착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p.290-291
영화가 포착할 수 있는, 혹은 발견할 수 있는 현실을 위해, 이미 설정된 허구를 거부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들은 허구를 전제하는, 그리고 허구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모델을 온전히 유지하면서 현실을 위해 허구를 버렸다. 니체가 이미 보여주었던 것, 즉 진실의 이상이란 가장 깊은 허구라는 것을 영화는 아직 현실의 심장부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야기의 진실성이 끊임없이 기반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허구 속이었던 것이다. 진실의 이상 혹은 모델을 현실에 적용할 때, 이것은 아주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게 되는데, 그것은 카메라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 말을 건네는 것이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어떤 의미로는 이야기의 조건 속에서 변한 것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은 자리를 바꾸었지만 변화되지 않았고, 동일성은 다르게 정의되지만 정의된 체였으며, 이야기는 허구적으로 진실이라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진실적인 것, 즉 여전히 진실 추구적이었다. 단지 이야기의 진실성이 끊임없이 하나의 허구로 구성되고 있었던 것이다. p.294-295
페로가 퀘벡의 실제 인물들에게 말을 건넬 때, 그것은 단지 허구를 제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허구를 파고 들어가는 진리의 모델로부터 허구를 해방하고 이 모델과 반대되는 순수하고 단순한 이야기 꾸며대기의 기능을 재발견하기 위해서이다. 허구와 대립하는 것은 현실도, 항상 주인들과 식민주의자들의 진리가 되어버리는 진리도 아닌, 거짓에 기억과 전설 그리고 괴물을 만들어낼 역량을 부여하는 빈자들이 갖고 있는 이야기 꾸며대기의 기능이다. <다음 세계를 위하여>의 흰 돌고래, <초목 없는 대지의 나라>의 순록,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넘어선 빛나는 짐승, 영화 <빛나는 짐승>의 디오니소스가 바로 그런 것들이다. 영화가 포착해야 하는 것은 실제적이건 혹은 허구적이건, 그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국면을 통한 인물의 동일성이 아니다. 그것은 스스로 '허구화하기' 시작하는, '생생하게 포착된 전설화하기'를 시작하는, 그래서 자신의 고유한 민중을 창안해내는 데 기여하는 실제 인물의 생성이다. 인물은 그 자신이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옮겨가면서 결합하는 이전과 이후의 시간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그가 결코 허구적으로 되지 않으면서도 이야기를 꾸며대기 시작할 대 그 자신은 타자가 된다. 그리고 한편 영화작가는 그가 만들어낸 허구를 몽땅 자신들의 이야기 꾸며대기로 대체해버리는 실제 인물들에 '개입하게' 될 때 그 자신 타자가 된다. 그리고 한편 영화 작가는 그가 만들어낸 허구를 몽땅 자신들의 이야기로 꾸며대기로 대체해버리는 실제 인물들에 '개입하게' 될 때 그 자신 타자가 된다. 이 둘은 모두 민중의 창조 속에서 소통하는 것이다. 나는 내가 누구였는지를 알기 위하여 알렉시스에 개입했고 모든 퀘백에 개입했는데, 결국 "나 자신에게 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발언권을 주는 것으로 충분했다". 이것은 이야기의 모방, 전설과 그것의 변형들, 퀘벡의 자유간접화법, 두 개의 머리가 달린, 혹은 '차츰차츰' 천 개의 머리가 달린 담론이 된다. 이 때 영화는 비로소 시네마-베리테라 불릴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은 영화가 모든 진실의 모델을 부수고 진리의 창조자, 생산자가 될 것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이것이야말로 진리의 영화가 아닌 영화의 진리이리라. p.295-296
셜리 클라크의 "나는 타자이다"는 이 점에서 그녀가 자기 자신에 대해 만들고자 했던 영화가 자신이 제이슨에 대해 만드는 영화가 되는 것에 있다. 영화화되어야 할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시네아스트가 뛰어넘어야 하는,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실제 인물이 뛰어넘어야 하는 이들 사이의 경계이다. 즉 시간이 필요하며, 영화 자체에 통합된 어떤 시간이란 필수적이다. 바로 이것이 캐서비츠가 <섀도우즈>에서부터, 그리고 이어 <얼굴들>에서 말했던 것이다. 즉 영화를 이루는 것, 그것은 영화보다 사람에 흥미를 갖는 것이며, '미장센의 문제' 보다 '사람의 문제'에 흥미를 갖는 것으로서, 그것은 카메라가 사람들 편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면 사람들을 카메라 쪽으로 넘어올 수 없기 때문이다. <섀도우즈>에서 그것은, 경계를 형성하는 흑인이자 백인인 두 인물들이며, 더 이상 영화와 구분되지 않는 이중적인 현실 속에서의 지속적인 넘나듦이다. 경계가 백인과 흑인, 또 영화와 비-영화 사이, 그 어디를 지나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게 되는 순간, 경계는 먼 소실적인 지평으로서만 포착될 수 있다. 영화는 끊임없이 자신의 표지를 넘어서, '적절한 거리' 와 단절을 고하고, 공간과 시간 속에서 자신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유보된 지역'을 지속적으로 넘어서야 한다.
우리는 이제 고다르가 어떻게 이로부터 이미지에 대한 보편적 방법론을 이끌어냈는가를 보게 될 것이다. 즉 어디에서 어떤 것이 끝나고, 또 어디에서 다른 것은 시작되는가, 경계란 무엇이고, 그것을 뛰어넘고 또 끊임없이 그것을 이동시키기 위해 어떻게 경계를 바라봐야 하는가. p.301-302
앞선 두 시간-이미지들은 실상 시간의 질서, 즉 관계의 공존, 혹은 시간의 내재적인 요소들의 동시성에 관한 것이었다. 반면 세 번째 이미지는 하나의 생성 속에서 이전과 이후의 시간을 분리하는 대신 이들을 결합하는 시간의 계열에 관한 것이다. 그의 역설은 순간 그 자체에 지속하는 간격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세 개의 시간 이미지는 간접적 재현과 단절했다는 공통점, 또한 시간의 경험적 흐름 혹은 연속, 연대기적 계기성, 이전과 이후의 분리를 깨뜨렸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이 이미지들은 그렇게 서로 소통하고 침투하지만, 동일한 작품 속에서 이 세 기호의 구별이 온존되게 한다. p.303
영화 이미지는 사유에 충돌의 효과를 주어야 하고, 사유를 자극하여 전체를 사유하듯 자신을 사유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숭고의 정의 그 자체이다. p.318
이 두 번째 계기에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운동-이미지로부터 그것이 표현하는 전체에 대한 명료한 사유로 이행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전제된, 그러나 애매한, 전체에 대한 사유로부터 이 전체를 표현하는 동요되고 뒤섞인 이미지로 간다. 전체는 이제 더 이상 부분들을 단일화하는 로고스가 아니라, 부분들에 침윤하여 그 내부에서 산포되는 도취 혹은 파토스이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이미지는 조형적 덩어리, 즉 시각적인 것과 음향적인 것(동시적인건 아니건), 형태의 지그재그, 행위의 요소, 몸짓과 실루엣, 비통사적인 시퀀스 들의 표현적 특성들로 충전된 기호적 질료를 구성한다. 이것은 하나의 랑그, 혹은 시원적 사유, 혹은 무엇보다도, 형상, 환유, 제유, 은유, 도치, 견인... 등에 의해 작동하는 내적 독백, 도취한 독백이다. 초기부터 에이젠슈테인은 내적 독백이 진정한 외연과 효과를 발견하는 곳은 문학이라기보다는 영화라고 생각했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내적 독백의 위치를 '인간의 사유의 흐름'에 한정시켰다. 바로 1935년의 연설에서 에이젠슈테인은 내적 독백이 정신적 자동기계, 즉 영화 전체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내적 독백은 너무도 개인적이라 할 꿈의 영역을 넘어서서, 실제적으로 집단적인 사유의 분절 혹은 사유의 고리를 형성하는 것이다. p.319
히치콕의 영화가 운동-이미지의 완성 그 자체로서 나타난다면, 그것은 히치콕의 영화에서 행동-이미지는 자신을 틀에 끼우고 그 사슬을 구성함과 동시에 하나의 맥락을 구성하는 '자연적 관계'에 다라 이미지로 회귀하는 '정신적 관계'로 지양된다는 데 있다. 이미지에서 관계로, 관계에서 다시 이미지로. 사유의 모든 기능은 이 회로에 포함된다. 이 영국인 천재에 부응하는 것은 물론 변증법이 아니라 관계의 논리이다(그리고 이것이 '충돌'을 대체하는 '서스펜스'를 설명한다). 그러므로 영화는 수많은 방식으로 사유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p.326
폭력이 더 이상 이미지와 그 떨림이 갖는 격렬함이 아닌 재현된 것의 폭력이 될 때 우리는 낭자한 피의 전횡으로 떨어지고, 위대함이 더 이상 구성의 위대함이 아닌 재현물의 단순하면서 순수한 부풀림에 불과할 때 더 이상 두뇌의 자극이나 사유의 탄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p.326-327
아르토의 선언과 에이젠슈테인의 선언은 첫눈에 보아서는 전혀 대립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미지에서 사유에 이르기까지에는, 사유 속에서 사유를 낳도록 해야 하는 충돌 혹은 진동이 존재한다. 그리고 사유에서 이미지에 이르기까지에는, 우리에게 다시 충격을 줄 수 있는, 일종의 내적 독백 속에서(꿈속에서라기보다는) 구현되어야만 할 형상이 존재한다. 그렇지만 아르토에게는 전혀 다른 무엇이 있다. 그것은 아직 영화에 근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영화의 진정한 주체-대상을 정의할 수 있는 것, 즉 무능력감에 대한 확인서이다. 영화가 주장하는 것은 사유의 역량이 아닌 사유의 '무능력함'이며, 사유란 결코 이 이외의 다른 어떤 문제도 가져본 적이 없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이 존재하기 어려움, 사유의 한 중심에 자리잡은 무력감. 영화의 적들이 영화에 비난했던 것("나는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것을 사유할 수 없다, 움직이는 이미지들이 나의 사유를 대체해버렸다"라고 말한 조르주 뒤아멜처럼), 바로 그것을 아르토는 영화의 어두운 영광, 그것의 깊이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사실상 아르토에게는 영화가 바깥으로부터 유입해오는 단순한 억압이 문제가 아니라, 중심에 선 억압, 붕괴 그리고 내면의 화석화, 끊임없이 사유를 희생자이자 대리자로 만드는 이 '사유의 약탈'이 문제였다. 아르토는 영화가 옆으로 빗나가 추상과 구상 혹은 꿈만을 만들 수 있을 분이라고 판단했을 때, 영화를 믿기를 단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영화가 본질적으로 이 사우의 한 중심에 자리잡은 사유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한, 아르토는 영화를 믿을 것이다. 아르토의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검토해보자면 < 32 >의 흡혈귀, <백정의 항거>의 광인, 그리고 무엇보다도 < 18초>의 자살한 사람 등과 같은 주인공은 "자신의 사유에 이르는 것이 불가능해져서", "단순히 이미지들, 혹은 모순적인 잉여 이미지들만이 눈앞에 지나가는 것을 볼 뿐"으로, 그의 "의식은 강탈당했다". 정신적 혹은 심리적 자동기계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생각들을 형식적으로 서로로부터 연역하는 사유의 논리적 가능성에 의해 정의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자동기계적 이미지와 함께 회로를 구성하면서 만들어질 사유의 물리적 역량에 의해서 정의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정신적 자동기계는 미라, 즉 "사유를 정의하는 사유의 불가능성"을 증언하는, 이 분해되고 마비된, 그리고 화석화되고 결빙된 심급이 되어버린 것이다. 표현주의는 이미 이 모든 것, 즉 사유의 탈취, 인격의 이중화, 최면술적 마비, 환각, 날뛰는 정신분열증 등을 친숙한 것으로 만들었다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바로 여기서 다시 한번 아르토의 독창성을 오해할 여지가 있다. 더 이상 사유가 표현주의에서처럼(마찬가지로 초현실주의에서처럼) 억압, 무의식, 꿈, 성욕, 혹은 죽음과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사유를 결정하는 이 모든 것들이 마치 더 상위의 '문제' 인 것처럼 사유와 대립하고, 또는 결정할 수 없는 것, 환기할 수 없는 것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배꼽, 혹은 미라는 사유가 부딪히게 될 환원 불가능한 꿈의 핵이 아니라, 바로 이 꿈들이 서로 부딪히고 튀어올라 부서지는 사유의 핵, '사유의 뒷면'이다. 표현주의가 불면에 밤의 처방을 했다면, 아르토는 꿈이 대낮의 처방을 감당하게 한다. 표현주의적 몽유병자는 < 18초> 혹은 <조가비와 성직자>에서의 아르토식의 깨어 걷는 환자에 대립한다.
그러므로 표면적인 단어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아르토의 기획과 에이젠슈테인의 개념화 사이에는 절대적인 대립이 존재한다. 아르토가 말했듯이 물론 뇌의 은밀한 현실과 영화를 결합하는 것이 문제이지만, 이 내밀한 현실은 전체가 아니라 오히려 틈 혹은 균열이다. 영화를 믿는 한, 아르토는 전체를 생각하게 하는 힘이 아닌, '무의 형상', '외관 속의 구멍' 을 이끌어들일 '이산적 힘'에 기대어 영화에 신용을 건다. 영화를 믿는 한, 아르토가 신용을 거는 것은, 이미지로 되돌아와 내적 독백의 요구와 은유의 리듬에 따라 그것들을 연쇄시킬 힘이 아닌, 다수의 목소리, 내적인 대화, 즉 하나의 목소리에ㅔ 항상 내재하는 또 다른 목소리에 의해 이미지들을 '탈-연쇄시킬' 힘인 것이다. 간단히 말해 아르토가 전복시킨 것은 영화-사유의 관계 전체이다. 즉 한편으로 이제 더 이상 몽타주를 통해 사유할 수 있는 전체란 존재하지 않으며, 다른 한편으로 이미지를 통해 언표될 수 있는 내적 독백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르토는 에이젠슈테인의 논증을 뒤집었다고도 말할 수 있으리라. 만약 사유가 그것을 낳는(신경, 골수) 충돌에 의존하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사유는 단지 이 유일한 사실, 즉 우리는 아직 사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자신에 대한 사유의 불가능성만큼 전체에 대한 사유의 불가능성, 끊임없이 화석화되고 해체되고 무너져 내리는 사유, 그것에 대해서만 사유할 수 있을 뿐인 것이다. p.329-332
셰페르는, 영화 이미지는 운동의 일탈을 감수하기 시작한 때부터, 세계의 일시정지를 시행하고, 또는 에이젠슈테인이 원했던 것처럼 사유를 가시화하는 대신 시각 속에 보여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사유 속에서 사유되지 않는 것에 말을 거는 어떤 혼란으로 이 가시적인 것을 침윤한다고 말한다. p.333
"여기서는 가시화된 사유가 문제인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은 사유의 최초의 분산, 이 시발적인 특질에 의해 침윤되고, 또 치유할 수 없이 감염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영화의 일상적 인간에 대한 묘사이다. 정신적 자동기계, '기계적 인간', '실험적인 허수아비', 우리 안에 있는 실험용 잠수 인형, 우리가 단지 머리 뒤쪽에만 갖고 있는, 그리고 우리의 시대도 우리의 유년기도 아닌 어던 순수상태의 시간에 속한 미지의 신체. p.334
정신적 자동 기계는 반응할 수 없는 만큼, 즉 사유할 수 없는 만큼, 더 잘 그리고 더 멀리 볼 수 있는 견자의 심리적 상황에 처해 있다. 이 때 미세한 출구란 무엇일 수 있을까? 믿을 것, 또 다른 세계가 아닌 인간과 세계의 관계, 사랑 혹은 삶을 믿을 것, 불가능성을 믿듯, 사유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사유될 수만 있는, 이 사유할 수 없는 것을 믿듯 그것들을 믿을 것. 바로 이러한 믿음이 부조리의 이름으로, 부조리에 의하여, 비사유를 사유의 고유한 역량으로 전화시킨다. 아르토는 이러한 사유의 무능력이 사유와의 관계에서 충격을 줄 수도 있을 단순한 열등성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았다. 사유의 무능력이란 사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결국 우리는 전능한 하나의 사유를 재건하려 하지 않고 이 무능력을 우리의 사유방식으로 삼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삶을 믿기 위하여 이 무능력을 사용해야 하고 사유와 삶의 동일성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다. "나는 삶에 대해 사유한다. 내가 건립할 모든 체계는 삶을 새로이 만들고자 하는 나의 인간으로서의 외침에 결코 필적하지 못할 것이다...." p.335
믿는다는 것은 오직 그리고 단순하게 신체를 믿는 것이다. 신체에 담론을 돌려주고, 이를 위하여 담론 이전, 말 이전, 즉 사물이 명명되기 이전(성 이전의 이름, 혹은 이름 이전)의 신체에 도달하는 것이다. 아르토는 이와 다른 것을 말하지 않았다. 즉 살을 믿을 것. "나는 삶을 잃어버렸던 사람, 그래서 온갖 수단을 써서 삶이 자신의 자리를 되찾게 해주려는 사람이다." 고다르는 <마리아께 경배를>을 예고하며 묻는다. 요셉과 마리아는 무슨 말을 나눴던 것일까? 그들이 사전에 나눈 말은 무엇이었을까? 신체, 살에 말을 돌려줄 것. 이런 점에서 고다르와 가렐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혹은 서로를 전복시킨다. 가렐의 작품은 신체를 믿기 위하여 마리아, 요셉 그리고 아기 예수를 이용한다는 목적 이외의 어떠한 다른 목적도 갖고 있지 않다. 사람들이 가렐과 아르토, 혹은 랭보를 배교할 때 여기에는 단순한 일반성을 넘어서는 어떤 진실이 있다. 우리의 믿음은 '살' 이외의 어떠한 대상도 갖고 있지 않으며, 우리는 우리가 신체에 믿음을 갖게 할 아주 특별한 이유들을 원하고 있다. p.340
문제제기적 연역은 사유에 앎, 혹은 그에 부족한 내적 확신을 돌려주는 대신, 사유에 바깥과, 그 실체를 갉아먹는 환원될 수 없는 이면을 사유에 새겨넣기 위해 모든 내면성을 사유로부터 박탈함으로써, 사유 속에 비사유를 부과한다. 사유는 모든 앎의 내재성 밖, '믿음'의 외재성에 의해 이끌려진다. 이것은 여전히 카톨릭 신자이고자 한 파졸리니의 방식이었을까? 혹은 반대로, 그의 군본적인 무신론자로서의 방식이었을까? 혹은 니체처럼 믿음을 엄격한 사유에 되돌려주기 위해 모든 신앙으로 잡아 뽑아올렸던 것은 아니었을까?
웰스에게 이미지의 깊이는 순수하게 광학적인 것이 되었고, 마찬가지로 드레이어에게서 평면적인 이미지의 중심은 순수한 시점 속으로 들어간다. 이 두 경우 모두 '초점화'는 이미지 바깥으로 튀어오른다. 이로써 자신의 고유한 중심들을 갖고 있던, 그리고 이 중심들 사이에 경로와 방해물을 제시했던 감각-운동적 공간은 단절된 것이다. 문제란 장애물이 아니다. 구로사와는 도스토예프스키의 방법론을 다시 취하면서, 자신들이 처한 상황보다 더 심층적인 '문제'의 소여들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탐색하는 인물들을 보여준다. 이렇게 해서 그는 앎의 한계를 넘어설 뿐만 아니라 행동의 조건들도 넘어서게 된다. 그리고 견자, 완벽한 '백치'가 되는 것이 문제인 순수한 시지각적 세계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웰스의 깊이 역시 동일한 유형을 갖는 것으로서, 그것은 방해물 혹은 감추어진 사물들과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유한 어두움을 통해 존재와 대상들을 보도록 하는 빛과 관계하면서 국지화된다. 투시력이 시선을 대체하듯, '룩스lux'로서의 빛은 '루멘lumen'으로서의 빛을 대체하게 되는 것이다. 다네는 드레이어의 평면적인 이미지뿐만 아니라 웰스의 깊이에도 적용될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이 장면화의 문제는 더 이상, 뒤에 무엇인가 볼 것이 있는가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어쨌든 나는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을 시선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이 단일한 쇼트 내에서 벌어지는가 하는 것이다." 어쨌든 내가 바라본다는 것, 바로 이것이 참을 수 없는 것의 공식이다. 이 공식은 사유와 바라본다는 것, 혹은 사유를 끊임없이 자신 밖으로, 앎과 행동을 넘어서는 곳에 위치시키는 광원과의 새로운 관계를 표현한다.
문제의 특성은 그것이 하나의 선택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다. 수학에서 하나의 직선을 동일한 부분으로 자르는 것은 문제인데, 그것은 직선을 불균등하게 자르는 일 도한 가능하기 때문이다. 원의 내부에 이등변 삼각형을 배치하는 것은 문제이지만, 반원에 직각을 그리는 것은 정리로서, 그것은 반원의 모든 각도가 직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가 수학적인 사물이 아닌 실존적인 결정들에 관계될 때, 우리는 선택의 문제가 점점 더 살아 있는 사유,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결단과 동일시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선택이란 이런저런 항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자의 실존 방식에 근거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파스칼의 내기가 갖고 있던 의미였다. 즉 문제는 신의 존재와 비-존재 사이의 선택이 아니라, 신을 믿는 자의 실존 방식과 신을 믿지 않는 자의 실존 방식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실상 훨씬 더 많은 수의 실존 방식이 문제시되었다. 신의 존재를 하나의 정리로서 간주하는 사람(신자), 선택할 줄 모르거나, 혹은 선택할 수 없는 사람(확신이 없는 사람, 회의론자) 등등. 간단히 말해, 선택은 사유만큼이나 방대한 영역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선택이란 비-선택에서 선택으로 이행하는 것이며 선택한다는 것과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모든 결과들을 이끌어낼 것이다. 선택과 비-선택(그리고 이것들의 변종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선택이란 우리를 내밀한 심리적인 의식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외부 세계 저 편에 있는 바깥과 절대적인 관계를 맺게 하며, 이것만이 우리에게 세계와 자아를 다시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앞서 어떻게 기독교적 영감을 받은 영화들이 단지 그 개념을 적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드레이어, 브레송, 혹은 로메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영화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주제로서, 즉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선택과 사유의 일치라는 주제로서 이를 찾아냈었나 하는 것을 보았다. 게르투르트 자신, 삶에서 인간은 선택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녀의 아버지와 선택에 대한 책을 쓰고 있는 친구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상태들을 통과해간다. 무시무시한 선의 인간 혹은 신자(선택할 필요가 없는 자), 확신이 없는 자 혹은 무관심한 자(선택할 줄 모르거나, 선택할 수 없는 사람), 끔찍스런 악의 인간(처음에는 선택하지만, 그 다음은 더 이상 선택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의 선택을 반복할 수 없는 사람), 마지막으로 선택 혹은 믿음의 인간(선택을 선택하는 사람 혹은 선택을 반복하는 사람). 바로 이것이 실존의 방식으로서의 영화, 이 방식에 대한 대면으로서의 영화, 그리고 세계와 자아가 동시에 의존하는 바깥과의 관계의 영화이다. 이 바깥의 지점은 은총인가 혹은 우연인가? 로메르는 자기 자신의 방식으로 '삶의 여정에 대한' 키에르케고르적인 단계들을 밟아간다.................................................연극과는 달리 영화에 이러한 특성을 부여한 것은 바로 영화의 자동기계적 성격이다. 자동기계적 이미지는 역할 혹은 배우뿐만 아니라 사유 그 자체에 대한 새로운 개념화를 요구한다. 선택된 것만을 잘, 그리고 효과적으로 선택하라. 이것이 바로 로메르 식의 격언일 수 있을 것이며, 또 브레송의 부제, 드레이어의 제구일 수 있을 것이다. 이 전체를 구성하는 것은 자동운동, 비사유, 그리고 사유 사이의 관계이다. 드레이어의 미라는 너무도 엄격하고 무거운, 혹은 너무도 피상적인 외부세계와 단절됐다. 그렇지만 이 미라는 또한 외부에 표현할 수도 없고 표현해서도 안되는, 그러나 더 심층적인 바깥에 의해 밝혀질 감정, 혹은 감정의 과잉으로 침윤되어 있다. 로메르에게 미라는 마리오네트로 대체되며, 동시에 감정은 바깥으로부터 마리오네트에게 영감을 주게 될 어떤 끈질긴 '관념', 심지어는 공허로 되돌려놓기 위해 포기하기까지 하는 이 끈질긴 관념으로 대체된다. 브레송과 더불어 세 번째 상태가 출현하는데 여기서 자동기계는 감정뿐만 아니라 생각마저 박탈된, 분할된 일상의 몸짓들로 이루어진 자동운동으로 축소되어 있지만, 그러나 또한 자율성을 갖고 있는 순수한 상태를 보여주게 된다. 바로 이것이 연극의 배우와 대립되는 순수하게 깨어 걷는 자, 브레송이 영화에 고유한 '모델'이라 부른 것이다. 그리고 사유 안의 사유할 수 없는 것처럼, 바깥의 사유는 바로 이렇게 순수화된 자동기계를 사로잡아버린다. 문제는 소격화의 문제와는 아주 다른 것이다. 이것은 순수하게 영화적인 자동운동, 그리고 그 결과들의 문제이다. 바로 이 이미지들의 물질적 자동운동이, 우리의 지적 자동운동에 속해 있는 사유할 수 없는 것처럼, 바깥으로부터 그 자신이 부과하는 사유가 솟아오르도록 하는 것이다.
자동기계는 외부세계로부터 단절되어 있지만, 그것에 생명을 불어넣는 더 심층적인 바깥이 존재한다. 그 첫 번째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현대영화에서 전체Tout가 갖는 새로운 지위이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즉 전체는 바깥이다라는 말과, 우리가 고전영화에 대해 말했던 것, 즉 전체는 열린 것이다라는 말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전영화의 열려 있음이란 시간의 간접적 재현과 동일한 것이었다. 운동이 존재하는 어디에나 시간 속 어느 부분에서 열린, 변화하는 전체가 존재하였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영화 이미지는 본질적으로 화면 밖 영역을 갖고 있었으며, 이 화면 밖 영역은 한편으로는 다른 이미지에서 현실화될 수 있는 외부세계로, 다른 한편으로는 연합된 이미지의 집합에서 스스로를 표현하는 변화하는 전체로 되돌려졌던 것이다. 여기에는 이미 거짓 매치조차 개입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현대영화를 예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경우 거짓 매치는 집합의 부분들에 대한 전체의 간접적 작용을 증언하는 운동의 비정상성 혹은 연합 장애trouble d'association만을 구성했던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국면들을 목도했다. 그러므로 전체는 이중적인 견인을 다라, 이미지들을 내재화하고 스스로를 이미지 속에서 외재화됨으로써 끊임없이 영화에서 구성되어왔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몽타주 혹은 사유의 역량을 정의했던 끊임없이 열린 총체화의 과정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전체, 그것은 바깥이다'라고 말할 때 사정은 전혀 다른 것이다. 왜냐하면 우선 문제는 더 이상 이미지들의 연합 혹은 견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와는 반대로 중요한 것은 이미지들, 혹은 두 이미지들 사이의 틈새, 즉 각각의 이미지들이 공허로부터 잡아뽑혀 다시 그리로 떨어지도록 하는 간격이 문제인 것이다. 고다르의 힘은 단지 그의 전 작품 속에서 이러한 구성방식(구성주의)을 사용했다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방식을 일종의 방법론으로 만들어 영화가 그것을 이용함과 동시에 그에 대해 스스로 질문을 던지도록 했다는 데 있다. <여기, 그리고 저기>는 이러한 성찰의 첫 번째 정점을 이루며, 이는 이어 < 6x2>에서 TV에 대한 성찰로 이행된다. 사실, 틈새란 연합된 이미지들 사이에만 존재하는 것이라고 반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여기, 그리고 저기>에서 골다 메르와 히틀러를 결합시키고 있는 이미지들은 참을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쩌면 이것은 또한 우리가 시각적 이미지에 대한 진정한 '독법'에 이를 만큼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고다르의 방법론에서는 더 이상 이미지의 연합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이 둘 사이에 어떤 틈새를 이끌어낼 전혀 다른 이미지를 선택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이것은 연합의 방식이 아닌, 수학자들이 말하는 미분의 방식, 혹은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불균등화의 방식이다. 즉 하나의 포텐셜이 주어지면, 어떤 다른 임의의 것이 아닌, 일단 선택했을 때 둘 사이에서 제3의 것, 혹은 어떤 새로운 것의 생산자로서의 포텐셜의 차이가 설정될 수 있는 또 다른 포텐셜을 선택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여기, 그리고 저기>는 팔레스타인의 페다인 그룹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프랑스의 부부를 선택한다. 달리 얘기하자면, 연합에 대해 틈새가 우선적이며, 혹은 바로 이 축소될 수 없는 차이가 유사성의 층위들을 결정하게 한다는 것이다. 균열은 우선적이 되고, 또 이런 의미에서 확장된다. 더 이상, 빈 공백들을 넘어서 가기조차 하는 일련의 이미지들의 사슬으 ㄹ따라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슬 혹은 연합으로부터 빠져나가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영화는 '줄지어 선 이미지들... 서로서로 노예들인 끝없는 이미지들의 사슬', 우리 역시 그 노예들인 연속된 이미지들의 사슬이기를 멈춘다(<여기, 그리고 저기>). 이것이 바로 모든 단일성의 영화를 거역하는, 사이ENTRE의 방법론, '두 이미지들 사이entre deux images'라는 방법론이다. 이것은 또한 모든 존재=존재하다로서의 영화에 모반을 꾀한 그리고ET의 방법론, '이것, 그리고 저것'의 방법론이다. *역주 4) 불어의 동사 Etre(이다, 있다)의 3인칭 변형인 est는 접속사 Et(그리고)와 발음이 동일하다. 바로 이러한 언어적 유희에서 출발하여, 고다르는 70년대 중반, 존재의 단일성을 주장하는 etre의 철학에("(주어는)...이다" 등등), 존재의 이질성, 복합성을 주장하는 관계의 철학으로서의 'Et' 혹은 '사이Entre'의 철학("(주어는)...이고, ...이고, 그리고... 그리고...")을 대비시킨다(< 6x2>,<여기 그리고 저기> 등). 들뢰즈는 많은 곳에ㅔ서 고다르 식의 Et의 철학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두 행동 사이, 두 감정 사이, 두 지각의 사이, 두 시각 이미지의 사이, 두 음향 이미지의 사이, 음향과 시각 사이. 식별 불가능한 것, 즉 경계를 보게 할 것(< 6x2>). 이제 전체는 일자-존재이기를 그치고, 사물들 사이를 구성하는 '그리고et', 혹은 이미지들을 구성하는 둘-사이가 되면서 변화를 맞게 된다. 이 때 전체는 블랑쇼가 "바깥의 산포"적 힘이라고 부른 것, 혹은 "간격의 현기증"이라고 부른 것과 혼동된다. 그것은 더 이상 이미지의 운동적 측면으로서 이미지가 연속되기 위해 뛰어넘어야 할 비어 있음이 아닌, 이미지에 근본적인 질문을 제가하는 것으로서의 비어 있음이다(마치 침묵이 담론의 운동적 측면이나 호흡으로서가 아닌, 담론에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는 것으로서 존재할 수 있듯이 말이다). 이 때 거짓-매치는 법칙이 됨과 동시에 새로운 의미를 띄게 된다.
이미지가 그 자체로 외부 세계와 단절된 것처럼 화면 밖 영역 또한 그 자체로 변모를 겪는다. 영화가 유성영화가 되었을 대 화면 밖 영역은 자신이 갖고 있던 두 측면에 대해 확신을 얻었던 것처럼 보인다. 즉 한편으로 소음과 목소리는 시각 이미지에 외재적인 원천을 가질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목소리 혹은 음악은 시각-이미지의 뒤 혹은 너머에 있는 변화하는 전체를 증언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바로 여기서 화면 밖 영역에 대한 음향적 표현으로서의 '보이스-오프'의 개념이 나온다. 그러나 만약 어떤 조건에서 영화가 유성영화의 결과를 끌어내었느냐고 묻는다면, 그리고 어던 조건 속에서 영화가 진정으로 그렇게 유성이 됐는냐고 묻는다면, 모든 것은 전복될 것이다. 그것은 음향 자체가 시각적 프레임화와 더불어 어떤 틈새를 부과하는 특이한 프레임화의 대상이 되는 때인 것이다. 보이스-오프의 개념은 보여진 것과 들려진 것 사이의 차이에 의해 대체되어 사라지고, 바로 이 차이가 이미지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더 이상 화면 밖 영역이란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미지의 외부는 이미지 내의 두 프레임화 사이에 존재하는 틈새에 의해 대체되는 것이다(바로 여기에서 다시 한번 브레송은 그 선구자라 할 수 있다). 고다르가 믹싱이란 단순히 서로 다른 음향적 요소들의 배분을 내포하는 것만이 아니라, 시각적 요소들과 미분적인 관계를 설정하는 작업을 포함함으로써 기존의 몽타주의 역할을 대체하게 된다고 말할 때 그는 위의 모든 중요한 결과들을 이끌어내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틈새들은 시각 이미지 내부, 또는 음향 이미지 내부, 혹은 시각 이미지와 음향 이미지 사이와 같이 도처에서 증식한다. 이것은 불연속적인 것이 연속적인 것에 우세하게 되었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와는 반대로, 영화에서 절단 혹은 단절들은 항상 연속적인 것의 역량을 이루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수학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영화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때로 소위 유리수적rationnelle 약분은 자신이 분리하는 두 집합 중의 하나에 속하게 되는데(하나의 끝, 혹은 다른 것의 시작), 이것이'고전적인' 영화의 경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때로 현대영화에서처럼 절단은 틈새가 되어, 즉 무리수적인irrationnelle 것이 되어, 집합의 어느 한쪽이 시작이 되고 다른 한쪽이 끝이 되는 것과 같이, 이 절단이 어느 한쪽에 속하게 되는 일이란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된다. 거짓 매치란 바로 이러한 무리수적 절단이다. 이렇게, 고다르에게 두 이미지의 상호작용은 그 어느편에도 속하지 않는 경계를 낳는다. 혹은 경계를 긋는다.
연속적인 것과 불연속적인 것은 결코 영화에서 대립된 적이 없었다. 이것은 이미 엡슈타인이 보여주었던 것이다. 대립되는 것, 혹은 적어도 구별되는 것은 오히려 전체Tout의 변동에 따라 이들을 조정하는 서로 다른 두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바로 여기에서 몽타주는 자신의 권리를 다시 회복한다. 전체가 시간의 간접적 재현인 한, 연속적인 것은 유리수적인 점들의 형태로, 그리고 공약 가능한 관계를 통해 불연속적인 것과 화해하게 된다(에이젠슈테인은 황금분할에서 명백하게 이에 대한 수학적 이론을 발견한다). 그러나 전체가 틈새를 통과하는 바깥의 역량이 될 때, 전체는 시간의 직접적인 현시가 되거나 혹은 비-연대기적 시간과의 관계 속에서 일련의 무리수적인 점들과 화해하는 연속성이 된다. 이미 웰스에게서나, 이어 레네, 그리고 고다르에게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이런 의미에서 몽타주는 직접적 시간 이미지 내에서의 관계를 결정하고, 단속적인 이미지와 플랑-세캉스를 화해시키면서 전혀 새로운 의미를 띄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사유의 역량은 여기서 사유 안의 비사유impense, 사유에 고유한 무리수적인 점, 즉 외부세계를 넘어선, 그러나 우리에게 세계에 대한 믿음을 다시 부여할 수 있는 바깥의 지점에 자리를 내어준다는 것을 보았다.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영화가 우리에게 세계에 대한 환상을 주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영화가 우리에게 세계에 대한 믿음을 다시 줄 것인가이다. 이 무리수적 지점, 이것이 바로 웰스의 환기할 수 없음inevocable, 로브-그리예의 설명할 수 없음inexplicale, 레네의 결정할 수 없음indecidable, 마르그리트 뒤라스의 불가능함impossible, 혹은 고다르의 (두 사물 사이의) 공약 불가능함incommensurable이다.
여기에, 전체의 지위의 변화와 상관항을 이루는 또 다른 결과가 있다. 이 상관적인 결과란 바로 내적 독백의 와해이다. 에이젠슈테인의 음악적 개념화에 따르자면, 내적 독백은 서로 연합되거나 연쇄되는 시각적, 음향적 표현들의 특질을 갖는 기호적 질료를 구성한 것이었다. 즉 각각의 이미지는 하나의 주조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것의 화음과 은유의 가능성을 한정해주는 화성적 배음들을 또한 갖고 있었다(이미지가 동일한 배음을 갖게 될 때 은유는 발생되었다). 그러므로 그 차이점, 혹은 대립점이 무엇이든지 간에 작가와 세계 그리고 인물들을 포괄하는 영화의 전체라 할 것이 존재했던 것이다. 작가가 보는 방식, 인물들이 보는 방식, 그리고 세계가 보여지는 방식들은 그 자체로 의미화하는 형상을 통해 작동하는 기표적 통일성을 형성했었다. 이러한 개념에 대한 최초의 일격은 내적 독백이 개인적 혹은 집단적 통일성을 상실하고, 익명의 파편들로 깨어지게 될 때 발생했다. 상투적인 것, 클리셰, 기존의 시각과 공식들이 외부세계와 인물의 내면성을 동일한 해체과정 속으로 이끌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결혼한 여인>은 바로 그녀가 뒤적이고 있는 주간지의 페이지, '발췌한 부분'들로 이루어진 카탈로그와 구별되지 않는다. 내적 독백은 내면과 외부에 부과된 동일한 비참함의 무게에 의해 파열되었다. 이것은 바로 도스 파소스가 이미 영화적 방법을 통해 소설에 끌어들인 변화이기도 하며, 고다르가 <결혼한 여인>에서 끝까지 밀어붙였던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더 심층적이고 중요한 긍정적인 변모의, 부정적인 혹은 비판적인 국면일 뿐이었다. 이 또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내적 독백은 각각의 연속된 이미지들이 독립적이고 그 내부의 각 이미지들이 앞선 이미지와 뒤이어 올 이미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자체로서 가치를 갖는 일련의 이미지들의 연속으로 대체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전혀 다른 기호적 질료이다. 이제 더 이상 완전화음과 '협'화음이 아닌 불협화음 혹은 무리수적 절단만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이미지의 화성적 배음이 아니라, 단지 계열을 형성하는 '탈연쇄된' 음조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은유 혹은 형상은 사라진다. <주말>의 공식, '이것은 피가 아니라 붉은색이다'는, 피란 이제 더 이상 붉은색의 화성적 배음이 아니며 이 붉음이야말로 피의 유일한 음조라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므로 문자 그대로 말하고 보여주어야 한다. 혹은 아무 것도 보여주지 말고 어떤 것에 대해서도 말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기존의 공식들에 따라 혁명가들이 우리의 문전에서 마치 식인종들처럼 우리를 포위한다면, 센에우아즈의 밀림 속에서 인간의 살을 먹고 있는 그대로의 그들을 보여주어야 한다. 만약 은행가가 살인자라면, 그리고 학생들은 죄수들이고 사진 작가들은 포주들이라면, 그리고 또한 노동자들이 고용인들에게 비역질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을 '은유화'함이 없이 그대로 보여주어야 하고, 그것에 따라서 계열들로 구성해야만 한다. 그리고 만약 주간지가 광고 페이지 없이는 '지탱하지' 못한다면, 이 페이지들을 찢어내면서 더 이상 주간지가 혼자 지탱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즉 문자 그대로 보여주어야 한다. 이것은 더 이상 은유가 아니라 증명이다(< 6x2>).
고다르와 함께, "사슬에서 풀려난"(이것은 아르토의 표현이다) 이미지는 그 정확한 의미에서 계열적이고 무조적인 것이 된다. 이미지들 사이의 관계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화성적 배음의 요구 혹은 협화음의 요구에 따라 좋은가 그렇지 않은가를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좋은가'를 아는 데 있다. 이것 혹은 저것처럼, '어떻게 그것이 좋은가'는 계열과 그것들의 무리수적 절단, 불협화음, 탈연쇄된 항들을 구성한다. 각각의 계열은 그 자신, 하나의 보는 방식 혹은 말하는 방식이 되는데, 이것은 슬로건을 통해 작동하는 여론의 방식이 될 수도 있고, 또 테제, 가설, 역설, 혹은 간계, 횡설수설에 의해 진행되는 계급, 성, 전형적인 인물들의 방식이 될 수도 있다. 각각의 계열은 작가가 다른 작가에 속할 수 있는 일련의 이미지들 속에서 간접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 혹은 반대로 무엇인가가 또는 누군가가 타자로서 간주된 작가의 비전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는 더 이상 내적 독백이 보증했던 작가와 인물 그리고 세계의 통일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작가가 자신과는 다른, 혹은 자신이 고정시킨 역할과는 다른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인물의 중재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거나, 혹은 인물이 마치 제3자를 통해 자신의 행동과 말이 이미 얘기된 것처럼 행동하고 말함으로써 서로에서 서로로 이행하는 '자유간접화법' 혹은 '자유간접적 시각'이 형성된다. 위의 첫 번째 경우가 바로 루쉬와 페로의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소위 부적절하게도 '다이렉트'라 불리는 영화에 해당되며, 브레송과 로메르에게서 볼 수 있는 무조적 영화는 그 두 번째 경우에 해당된다 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 현대영화란 내적 독백의 단일성이 붕괴되고 그것이 다양성, 형태의 왜곡, 자유간접화법의 이타성으로 대체되는 영역의 이동에 의해 특징지어진다고 파졸리니가 말할 때, 파졸리니는 현대영화에 대한 심오한 직관력을 갖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p.345-358
이런 의미에서 고다르의 반성적 장르들은 영화가 통과해가는 진정한 범주들을 구성한다. 그리고 몽타주 테이블은 일종의 범주들의 테이블로서 간주될 수 있다. 고다르에게는 무엇인가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것이 존재한다. 그의 영화들은 진실임직함의 단계와 논리적 역설을 동시에 통합하는 삼단논법들이다. 여기서는 아라공이 암시하는 것과 같은 카탈로그의 방식이나 '콜라주'의 방식이 아니라 각자가 하나의 범주에 의해 표시되는 계열들의 구성방법(계열들의 유형은 아주 다양할 수 있다)이 문제이다. 그것은 마치 고다르가, 우리가 조금 전까지 다라온 길과는 정반대되는 길을 다시 거슬러, '문제'의 한계에서 '정리'를 재발견하고 있는 것과도 같다할 수 있다. 수학자 불리강은 두 개의 분리할 수 없는 심급으로서 한편에 문제들 그리고 다른 한편에 정리들 혹은 전체적 종합을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미지의 요소들에게 계열의 조건을 부과하는 반면, 전체적 종합은 이 요소들이 추출되어 나온 범주들을 지정한다(점, 직선, 곡선, 평면, 원 등). 고다르는 끊임없이 범주들을 창조한다. 바로 여기서 그의 많은 작품들에서 볼 수 있는 그토록 특별한 담론의 역할이 나오게 되는데, 이미 다네가 지적했듯이 그의 작품들에서 하나의 담론화된 장르는 항상 또 다른 장르의 담론으로 귀착된다. 고다르는 문제에서 범주로 간다. 이 범주들이 다시 하나의 문제를 되돌려주기까지 말이다. 예를 들어 <삶, 각자 알아서 구하라>의 구조가 그것이라 할 수 있다. '상상적인 것', '두려움', '매매', '음악'으로 구성된 네 개의 커다란 범주들은 다음 작품의 대상이 될 도 다른 새로운 문제, '열정(수난)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열정(수난)이 아니다...'로 귀착된다.
고다르에 다르면 범주는 결정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다. 이것들은 각각의 영화에서 재분배되고 재개정되며 재창조된다. 이러한 계열들의 재단에 매번 새로운 범주들의 몽타주가 상응한다. 매번 범주들은 뜻하지 않은 것이어야 하지만, 임의적이어서는 안되고 확고하게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들 사이에 강렬한 간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야만 한다. 실상 범주들은 서로에게서 유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관계는 '그리고'의 유형에 해당한다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 '그리고'는 필연성을 띠어야 하는 것이다. 종종 시각적 이미지들은 계열을 구성하는 반면, 씌어진 단어는 범주를 지시한다. 바로 여기에서 이미지에 대한 단어의 아주 특별한 우선권, 그리고 스크린을 칠판처럼 제시하기 들이 연유하게 된다. 또한 씌어진 문장에서 접속사 '그리고'는 고립되고 확장된 가치를 취할 수도 있다(<여기, 그리고 저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틈새의 재창조가 이미지들의 계열 사이의 불연속성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연속적으로 한 계열에서 다른 계열로 넘어갈 수 있음과 동시에, 소요에서 발라드로 이행하는 <미치광이 피에로>, 혹은 일상적 삶에서 연극으로 이행하는 <여자는 여자다>, 또는 가사 장면이 서사시로 이행하는 <경멸>에서 볼 수 있듯, 한 범주와 다른 범주의 관계는 국지화될 수 없게 되기도 한다. 혹은 씌어진 단어 그 자체가 변동, 반복 그리고 역작용을 일으키는 전자적인 처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이미 <미치광이 피에로>의 노트 상에서 단어 예...술la...rt이 죽음이la mort으로 변모했듯이 말이다). 그러므로 범주는 결코 궁극적인 해답이 아니라, 이미지 그 자체에 반성을 불러일으키는 문제들의 범주라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문제제기적 기능 혹은 명제적 기능이다. 이후 고다르의 각 작품을 따라다니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무엇이 범주의 역할, 혹은 반성적 장르의 역할을 하는가? 가장 단순하게 그것은 서사시, 연극, 소설, 춤, 혹은 영화 자체와 같은 미학적 장르일 수 있다. 그러나 시각적 이미지들이 춤, 소설, 연극, 기존의 영화 등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에피소드를 위해, 하나의 계열을 따라 영화를 '하고' 무용을 하고 소설을 하고 연극을 하기 시작하는 한, 자신을 성찰하고 또 다른 장르들을 성찰하는 것은 영화의 몫이다. 범주 혹은 장르들은 또한 심리적 능력들일 수 있다(상상력, 기억, 망각 등...). 그러나 이 범주 혹은 장르가 아주 의외의 양상을 띌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반성적인 인물들, 즉 그 자신 스스로, 자신의 특이성과 함께 일련의 시각 이미지의 계열이 향한, 혹은 향해 갈 한계를 드러내는 독창적인 개인들의 개입과 같은 유명한 장면들이 그것이다. <네 멋대로 해라>의 장-피에르 멜빌, <그녀의 삶을 살다>의 브리스 파랭, <중국 여인>의 장송과 같은 사상가들, <미치광이 피에로>의 드보나 레바논의 여왕 같은 익살극 배우들, <그녀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두세 가지 것들>의 엑스트라들의 견본(내 이름은...이오, 나는 이런 일을 합니다, 나는 저런 것을 좋아합니다...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 모든 개입자들은 범주에 완벽한 개인성을 부여하면서 범주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 가장 감동적인 예는 아마도 브리스 파랭의 개입일 것이다. 파랭은 여기서 여주인공이 모든 이미지의 계열을 통해 (나나Nana의 문제) 전력을 다해 질주해 가고 있는 한계로서의 언어의 범주를 드러내고 그것을 개체화한다.
간단히 말해 범주는 단어일 수도, 사물일 수도, 행위 혹은 인물일 수도 있다. <헌병대들>은 전쟁을 과장하거나 혹은 고발하는, 또 하나의 전쟁에 대한 영화가 아니다. 이 영화가 다른 점은 전쟁의 범주들을 영화화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고다르가 말했듯이, 그것은 육, 해, 공의 군대와 같은 정확한 사물일 수도 있고, 혹은 점령, 전투, 저항과 같은 '정확한 관념'일 수도 있으며, 폭력, 패주, 의욕 상실, 웃음거리, 무질서, 기습, 공허와 같은 '정확한 감정'일 수도 있고, 소음, 침묵과 같은 '정확한 현상'일 수도 있다. 우리는 색채 그 자체 또한 범주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색채는 사물, 인간 혹은 씌어진 말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자체로 범주들을 형성한다. 예를 들어 <주말>에서 붉은 색은 하나의 범주이다. 만약 고다르를 위대한 색채주의자라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지가 그 안에서 스스로를 반성해볼 수 있는 거대한 개체적 장르로서 색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고다르의 색채 영화에 나타나는 지속적인 방법론이기도 하다(음악 혹은 동시에 음악과 색채 양자 모두에 대한 성찰을 포함하여 말이다). <프레디 뷔아시에게 보내는 편지>는 순수한 상태의 색채적 방법론을 추출해낸다. 위와 아래가 있고, 푸른, 하늘의 로잔, 녹색과 대지, 그리고 물에 젖은 로잔이 있다. 두 곡선 혹은 두 외곽선, 그리고 이 둘 사이에 회색, 중심, 직선들이 있다. 색채는 이제 도시가 자신의 이미지를 비춰보고 그로부터 하나의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의 수학적인 범주가 된다. 세 개의 계열, 질료의 세 가지 상태, 그리고 로잔의 문제. 부감, 앙각, 정지 등의 모든 영화적 테크닉들은 바로 이러한 성찰을 위한 것이다. 어쩌면 고다르에게 로잔에 '대한' 주문 영화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았다고 비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고다르는 로잔과 색채의 관계를 전치시켜, 마치 로잔에만 합당한 범주표이기라도 하듯 색채 내부로 로잔이 통과하도록 했던 것이다. 이것은 바로 구성주의적인 것이다. 고다르는 색채, 로잔의 담론, 간접적인 비젼을 통해 로잔을 재구성했던 것이다. 영화는 서사적이기를 그쳤지만, 그러나 고다르와 함께 영화는 가장 '소설적인 것'이 되었다. <미치광이 피에로>가 말하듯 "다음 장. 절망. 다음 장. 자유. 쓰라림"과 같은. 바흐친은 서사시 혹은 비극과는 달리 소설이란 더 이상 인물들이 여전히 단일하고 동일한 언어를 통해 얘기하는 집단적 혹은 분배적인 통일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정의한다. 그와는 반대로 소설은 때로 익명적인 일상언어, 혹은 때로는 한 계급, 한 집단, 한 직업 언어, 또 때로는 인물의 특유한 언어를 필연적으로 차용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인물, 계급 성은 작가의 자유간접화법을 형성하고, 마찬가지로 작가는 그들의 자유간접적인 시각(그들이 바라보는 것, 그들이 아는 것 혹은 알지 못하는 것)을 형성한다. 혹은 오히려 인물들은 작가의 시각-담론 속에서 스스로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작가는 인물의 시각-담론 속에서 간접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게 된다. 간단히 말해 소설과 그것의 '복수언어주의plurilinguisme', 담론 그리고 비전을 구성하는 것은, 익명적이건 그렇지 않건, 장르 내에서의 반성이다. 고다르는 영화에 바로 이러한 소설의 고유한 역량들을 부여했던 것이다. 그는 스스로 끊임없이 나는 타자가 되는 중재자로서의 반성적 인물들을 제공한다. 작가와 인물 그리고 세계를 결합하면서 그들 사이를 통과애가는 것은 이제 단절된 선, 지그재그로 이어지는 선이다. 바로 이러한 세 가지 관점으로부터 현대영화는 사유와의 새로운 관계를 발전시켰던 것이다. 이미지들 사이에 개입하는 바깥의 힘을 위한, 전체 혹은 이미지의 총체화의 소멸. 자유간접화법과 시각을 위한 영화의 전체로서의 내적독백의 소멸. 우리에게 여기 이 세계에 대한 믿음만을 남겨놓은 단절을 위한, 세계와 인간의 통일성의 소멸. p.360-364
'그러므로 내게 신체를 달라.' 이것이야말로 철학적 전복을 알리는 공식이다. 신체는 더 이상 사유를 그 자신으로부터 떼어놓는 장애물이거나 사유할 수 있기 위해 극복해야만 할 것이 아니다. 그와는 반대로 사유가 비사유에 도달하기 위해, 즉 삶에 도달하기 위해 잠겨들어가는 혹은 잠겨들어가야만 하는 것이다. 신체가 사유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완강하고 고집스러운 신체가 사유하기를 강요한다는 것, 그리고 사유로부터 비켜난 것, 즉 삶을 사유하기를 강요한다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사유의 범주 앞에 삶을 출두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유를 삶의 범주 속으로 투기해야 할 것이다. 삶의 범주란 정확히 말해 신체의 태도, 자세이다. '우리는 아직 신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잠과 도취, 그리고 노력과 저항 속에 있는 신체. 사유한다는 것, 그것은 사유하지 않는 신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배운다는 것, 즉 신체의 능력, 태도 혹은 자세를 배운다는 것이다. 신체를 통하여(더 이상 신체의 중재에 의해서가 아닌) 영화는 정식, 사유와 결합한다. '그러므로 내게 신체를 달라', 이것은 먼저 일상적 신체 위에 카메라를 걸쳐놓는 것이다. 신체는 결코 현재에 있지 않다. 그것은 이전과 이후, 피로와 기다림을 내포한다. 피로, 기다림 혹은 절망조차 신체의 태도이다. 이 점에서 안토니오니보다 더 멀리 간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의 방법론, 즉 행동을 통한 내면, 그리고 더 이상 경험 그 자체가 아닌 '지나간 경험들로부터 잔존해 있는 것', '모든 것이 말해졌을 때 그 이후에 오는 것' 이라는 방법론은 필연적으로 신체의 태도, 혹은 자세를 경유해간다. 이것이 바로 시간-이미지, 시간의 계열이다. 일상적 태도란 신체에 이전과 이후를 놓는 것, 신체 속의 시간, 종말의 계시자로서의 신체를 의미한다. 신체의 태도는 사유가 시간, 그리고 외부 세계보다 가없이 멀리 있는 바깥과 관계 맺게 한다. 아마도 피로는 이 최초의, 그리고 최후의 태도일 것인데, 그것은 피로란 동시에 이전과 이후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블랑쇼가 말한 것, 그리고 또한 안토니오니가 보여준 것, 즉 의사소통의 모든 비극적 드라마가 아닌 거대한 신체의 피로, <외침>의 기저에 있는 피로, 그리고 사유에 '어떤 전달 불가능한 것', '비사유', 즉 삶을 제안하는 피로이다.
그러나 또 다른 신체의 극점, 또 다른 영화-신체-사유의 연계가 있다. 신체를 '증여한다는 것', 카메라를 신체에 걸치는 것은 여기서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 더 이상 일상적인 신체를 따르거나 바짝 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신체로 하여금 제의를 통과하게 하며, 신체를 유리상자 혹은 결정체에 집어넣고, 카니발과 가면 무도회를 통해 그로테스크한 신체로 빚어내며, 또한 이로부터 결국 가시적인 신체의 사라짐에 이르도록, 우아한 혹은 찬란한 신체를 추출해내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카르멜로 베네는 가장 위대함 결정체-이미지의 구축자 중 한 사람이다. <터키인들의 노트르담>에서 궁전은 이미지 속을 부유한다, 혹은 무엇보다도 <돈 주앙>에서, 그리고 카메라와 무녀 사이에 수많은 천들이 겹쳐지는 <카프리치>의 너울들의 춤에서, 이미지 전체는 요동하거나 헐떡거리고, 반사된 빛은 강렬한 색채로 물들여져, 색채 그 자체는 결정화된다. 성체현시대의 눈처럼 시선은 결정체를 사로잡고 있지만, 이보다 앞서 무엇보다도 봐야 할 것은 끊임없이 다시 시작하는 무용한 몸짓, 그리고 어떤 불가능한 자세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방해됨에도 다시 시작하는 태도 속에서 지쳐버린 <노트르담>의 해골들, <카프리치>의 늙은이들, <살로메>의 늙어 초췌한 성인이다(<살로메>의 예수는 혼자 힘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지 못한다. 어떻게 나머지 손이 저 혼자 손바닥에 못을 박을 수 있을 것인가?). 베네에게서 의식은 패러디로 시작해 음향과 몸짓으로 발전한다. 왜냐하면 몸짓은 또한 음성적이며, 그래서 해위 불능과 실어증은 동일한 자세의 두 국면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로테스크에서 빠져나오는 것, 그로부터 뽑혀나오는 것은 더 우월한 기계장치로서의 여인의 우아한 신체, 즉 늙은이들과 춤추거나 은밀한 의지의 양식화된 태도를 펼치거나 도취상태로 응결된 여인의 신체이다. 이것은 결국 제3의 신체, 즉 다른 모든 신체를 통과해가는 '주인공'의 신체 혹은 제의 주재자의 신체를 해방하기 위해서는 아닐까? 결정체 속으로 미끄러져 가고 있었던 눈은 이미 바로 그의 것이었으며, 궁전의 역사가 주인공의 자서전이 되어버린 <노트르담>에서처럼 결정체적 환경과 소통하는 것도 그이다. 자신에게 주사를 놓는 데 끝내 이르지 못하는 불가능한 자세에 처해진, 붕대로 칭칭 감긴 미라로서, 끊임없이 자신의 죽음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노트르담>에서처럼, 저지되고 실패한 몸짓들을 되풀이하는 것 역시 바로 그이다. 또한 죽기 위한 최상의 몸의 위치를 찾는 <카프리치>의 시인처럼, 마칯ㅁ내 사라져버릴 힘을 얻기 위하여 우아한 신체를 범하고, 또는 어떤 점에서 이 신체를 이용해야만 하는 것도 그이다. 사라져버린다는 것, 이것은 이미 등을 보이면서 달을 향해 멀어져가버린 살로메의 어두운 의지이기도 했다. 그러나 주인공이 이렇듯 모든 것을 되풀이해 다시 시작할 때, 그것은 가시적인 신체가 사라져버린 바로 거기에서, 비장한 것 혹은 쇼펜하우어적인 지점, 혹은 <부족한 햄릿>에서의 햄릿의 지점을 정의할 무-의지의 지점에 그가 도달했기 때문이다. 무-의지에서 해방되는 것은 음악과 말, 그리고 오로지 음향적인 신체, 혹은 새로운 오페라적 신체 속에서의 음악과 말의 얽힘이다. 실어증조차 거기에서는 고귀하고 음악적인 언어가 된다. 더 이상 인물이 하나의 목소리를 갖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들 혹은 오히려 주인공의 발성 방식들이야말로, 음악이 되어버린 환경에서 유일한, 그리고 진정한 제의적 인물이 된다고 할 수 있다(중얼거림, 호흠, 외침, 욕지거리...). 문둥병에 뒤덮인 신체로부터 솟아나와, 영화가 갖는 음향적 역량을 실행한, <살로메>의 헤롯 안티파스의 그 경이로운 독백처럼 말이다. 이러한 시도 속에서, 확실히 베네는 그 누구보다도 아르토와 닮아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아르토가 겪었던 것과 동일한 모험을 통과해간다. 그 또한 영화를 '믿었'고 영화가 연극 자체보다 더 심오한 연극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믿었으나, 그것은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그는 곧 연극이 훨씬 더 스스로를 갱신하고 또 너무도 시각적인 영화에서는 여전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음향젖ㄱ 역량을 해방하는 데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에게 연극화란 영화적인 것 대신 전자적인 매체를 통합하기까지 하는 것이었다. 그래도 어느 한 순간, 너무도 일찍, 자발적으로 중단해버린 작품의 시간과도 같은 짧았던 순간, 그가 영화를 믿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영화가 가질 수 있었던 가능성, 곧 신체를 증여할 가능성, 즉 의식과 제의 속에서 신체를 만들어내고 탄생하게 하고 또 사라져버리게 할 가능성 말이다. 아마도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연극-영화의 관계에 대한 어떤 내기를 포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상적 신체와 제의적 신체라는 신체의 이 양 극점을 우리는 실험영화에서 볼 수 있거나 혹은 재발견할 수 있다. 실험영화는 필연적으로 앞서 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뒤에 오기조차 한다. 실험영화와 그 이외의 영화의 차이점은, 영화적 과정의 필연성과는 다른 필연성에 의해, 전자는 실험하는 반면 후자는 발견한다는 것이다. 실험영화에서 때로 이 과정은 일상적 신체에 카메라를 들이대는 것으로 나타난다. 고정된 화면으로 6시간 반 동안 잠자는 사람을 찍은, 그리고 45분 동안 버섯을 먹고 있는 사람을 찍은 유명한 와홀의 에세이가 바로 그것이다. (<잠>, <먹다>). 이와는 반대로, 때로 이 신체의 영화는 브루스, 뮈엘, 니치 등과 같은 비엔나 학파의 에세이에서 볼 수 있듯, 하나의 의식을 꾸미로, 입문적이고 제의적인 양상과 함께, 공포 혹은 혐오를 유발하면서까지, 신성한 신체의 금속적이고 액체적인 모든 역량들을 소환하고자 한다. 그렇지만 필연적으로 가장 성공을 거두지 못한 극단적 예를 제외한다면, 과연 이를 서로 반대되는 두 양 극점이라 말할 수 있을까? 가장 성공적인 경우, 우리는 오히려 일상적 신체란 어쩌면 결코 오지 않을 의식에 대한 채비를 하는 것이며, 어쩌면 끊임없이 기다려야만 할 의식을 준비하는 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마아스와 무어의 <사랑의 메카닉>에서 볼 수 있는 커플의 오랜 준비, 그리고 모리시와 와홀의 <육체>에서 볼 수 있는 매춘부의 준비가 바로 그것이다. 주변인들을 자신의 영화의 인물로 삼으면서, 언더그라운드 영화는 끊임없이 마약, 매춘, 성적 도착 등의 상투적인 의식의 준비로 흘러 들어가는 일상성의 수단을 갖게 된다. 신체의 태도와 자세는 이렇게 느린 신체의 일상적 연극화를 경유한다. 이 중 가장 아름다운 작품 중 하나라 할 <육체>가 남자, 여자 그리고 아이라는 기본적인 세 신체의 연기 속에서 피로와 기다림, 그리고 이완의 순간을 보여주고 있듯이 말이다.
중요한 것은 이 극점들의 차이가 아니라 그들 상호간의 이행, 혹은 태도와 자세로부터 '게스투스' *역주 1) 게스투스gestus는 브레히트가 사용하여 유명해진 개념으로서 단순한 몸짓(제스처)만이 아닌 행위action와 성격caractere 사이의 존재할 수 있는, 인물들의 모든 사회적 관계를 표상하는 기호들, 가장 기본적인 인간적 태도들을 가리킨다. 제스처geste의 어원이라 할 이 '게스투스'라는 말은 라틴어인 'gerere', 즉 '하다, 행동하다faire'라는 동사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지만 앞서 말한 대로 브레히트적 의미에서 게스투스는 반드시 '사회적'인 것, 즉 '조찌알레 게스투스soziale gestus'이다. 예를 들어 부하 직원이 상사에게 야단을 맞는 것은 게스투스이지만, 누군가가 길가에서 혼자 넘어지는 행위는 브레히트적 의미에서 게스투스가 아니다.* 로의 은밀한 이행이다. 브레히트는 자신이 만들어낸 이 게스투스 개념을, 줄거리 혹은 주제로 환원될 수 없는 연극의 본질로 삼았다. 물론 다른 종류의 게스투스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브레히트에게 게스투스란 무엇보다도 사회적인 것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게스투스라 부르는 것은 태도의 혹은 태도들 사이의 관계 혹은 매듭, 그리고 어떤 전제된 이야기나 이미 존재하고 있는 줄거리, 혹은 행동-이미지에 의존하지 않는 한에서의 그들 상호간의 배열을 가리킨다. 이와는 반대로 게스투스란 태도들 그 자체의 발전을 말하며, 바로 이런 점에서 종종 아주 은밀한, 신체의 직접적인 연극화를 추진하는데, 그것은 연극화란 모든 역할로부터 독립하여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삶 속에 사유만큼이나 신체 속에 시간을 부여하는 범주로서의 태도에 이르기 위하여, 이야기, 줄거리, 혹은 행동, 심지어는 공간까지 해체했던 캐서비츠 작품이 갖는 위대성이다. 인물들은 이야기나 줄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야말로 인물들로부터 분비되어야 한다고 캐서비츠가 말할 때, 그는 바로 신체의 영화가 요구하는 것을 요약하고 있다 할 것이다. 인물은 자신의 신체의 태도로 환원되고, 그로부터 나와야 하는 것은 게스투스, 곧 줄거리 전체의 가치를 갖는 '볼거리', 연극화 혹은 극화이다. <얼굴들>은 종국에 찡그림에까지 이르는, 그리고 기다림, 피로, 현기증, 낙담을 표현하는 얼굴들처럼 제시된 신체의 태도들 위에 구축된다. p.377-383
인물들은 "몸짓에서 몸짓으로, 말에서 말로 가면서 스스로 구성되고, 영화가 진척되어감에 따라 촬영의 경험은 그들에게 일종의 계시처럼 작용하고, 영화의 각 진행상태는 그들의 행동에서 새로운 발전을 이루어내며, 그들 자신의 고유한 지속의 시간이 정확히 영화의 지속의 시간과 일치되게 함으로써, 인물들은 스스로 자신을 만들어나간다. p.383
이 사슬은 자기 자신밖에 이야기할 줄 모르는 남자들에게 계시자의 역할을 하거나, 더욱 심층적으로는 방의 창문을 통해서나 기차의 유리창, 즉 전적인 소리의 예술을 통해 단지 보이거나 들릴 뿐인 환경에 대해 그러한 계시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 자리에서 혹은 공간 속에서, 여자의 몸은 시대와 상황, 장소들을 통과해가게 하는 이상한 노마디즘을 획득한다(그리고 이것이 바로 문학에서의 버지니아 울프의 비밀이기도 했던 것이다). 신체의 상태는 각각의 조응하는 태도들을 연결하는 느린 제의를 분비하면서, 인간의 역사와 세계의 위기를 포착하는 여성적 게스투스를 펼친다. p.389
'이미지의 부재', 검은 스크린 혹은 흰 스크린은 동시대 영화 속에서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노엘 버치가 잘 보여주었듯이 그것은 더 이상 디졸브처럼 단순한 구두점의 구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와 그 부재 사이의 변증법적 관계 속으로 진입하여, 순수하게 구조적인 가치를 갖는다(브래키지의 <검은색에 대한 성찰>과 같은 실험영화에서처럼). 검은 스크린 혹은 흰 스크린이 갖는 이 새로운 가치는 앞서 분석한 특징들에 잘 상응하는 것처럼 보인다. 한편으로,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이미지들의 연합 혹은 그들이 연합되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지들 사이의 틈새이며, 다른 한편으로, 일련의 이미지들 내에서의 절단은 더 이상 한 이미지의 끝 혹은 다른 이미지의 시작을 표시하는 유리수적인 절단이 아니라, 그 어느 것에도 속함이 없이 그 자체로 가치를 갖는 소위 무리수적인 절단이다. 가렐은 이 무리수적인 절단에 놀라운 강렬함을 줄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앞선 이미지들의 계열은 끝을 갖지 않고, 마찬가지로 뒤이어 오는 이미지의 계열 역시 시작을 갖지 않음으로써 이 두 계열들은 그들의 공통된 한계로서 검은 스크린 혹은 흰 스크린으로 수렴되는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사용된 스크린은 이제 변주들을 지탱하는 토대가 된다. 검은 스크린과 노출 부족의 이미지, 만들어져가고 있는 어두운 부피를 짐작케 하는 깊은 어둠, 또는 고정된 혹은 움직이는 광점에 의해 표시된 검은 색, 그리고 모든 검은 색과 빛의 결함, 흰 스크린과 노출 과다된 이미지, 우윳빛의 이미지 혹은 신체를 포섭해버리는 춤추는 입자들로 이루어진 눈발과 같은 이미지.... 또한 <비밀의 아이>에서 종종 빛의 깜박거림은 이미지를 낳고 또 흰색과 검은 색의 역량들을 수렴한다. 가렐의 전 작품에 걸쳐 흰 스크린 혹은 검은 스크린은 단지 구조적인 가치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발생적인 가치를 갖는다. 그것은 자신의 변주 혹은 색조들을 통해 신체를 구성하는 역량(이후 가장 원초적인 신체라 할 남자, 여자, 그리고 아이)과 자세를 발생시키는 역량을 획득한다. 아마도 이는 진정으로 구성적인, 구성의 영화의 첫 번째 예라 할 것이다. 신체를 구성할 것,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에게 세계에 대한 믿음을 다시 부여할 것, 우리에게 이성을 돌려줄 것... . 영화가 이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만약 세계가, 우리가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나쁜 영화가 되어버렸다면, 진정한 영화는 우리에게 세계를 믿을 이유, 그리고 사라진 신체를 믿을 이유를 주는 데 보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영화가 치러야 할 값은 여전히 관기와의 대면이리라. p.396
이렇게 영화가 생샌해낸 것은 사유 속에 깃들인 비사유처럼 우리가 우리 머리 뒤쪽에 갖고 있는 '알 수 없는 신체'의 발생, 여전히 시선에서 빗겨난 시각적인 것의 탄생이다. 질문을 바꾸어버린 이러한 대답들은 장-루이 셰페르의 영화의 일상적 인간의 것이다. 그의 대답이 내포하는 것은, 영화의 목표는 지각과 행동으로 신체의 현전을 재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흰색, 검은 색 혹은 회색과의 관계에 의해(혹은 색채와의 관계에 의해), 도한 '아직은 형상이 아닌, 아직은 행동이 아닌 시각적인 것의 개시' 와의 관계에 의해 신체의 가장 시원적인 발생에 관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에, 셰페르가 영화의 역사, 특히 드레이어 혹은 구로사와에게서 산발적인 예를 찾았던 것, 바로 그것으로부터 가렐은 체계적인 요약은 아니지만 영화가 자신의 본질 혹은 적어도 그 본질 중의 하나와 일치될 수 있을 자기갱신적인 영감을 끌어낸 것은 아닐까 한다. 이 본질이란 중성적인, 무형의, 혹은 검은, 눈발과 같은, 혹은 깜박거리는 이미지들로부터 출발한 신체의 구성의 과정, 혹은 사행이다. 문제는 물론 신체의 현전이 아닌, 신체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에게 세계와 신체를 다시 돌려줄 수 있는 믿음에 대한 것이다. 그러므로 카메라는 신체의 발생에 상응하는, 그리고 신체의 가장 시원적인 자세에 대한 형식적인 연쇠를 이룰 수 있는 운동 혹은 위치를 발견해야 할 것이다. 세잔느와 어느 정도 유사하게, 세계의 여명은 추상적인 형상이 아닌 발생과 탄생으로서의 점, 면, 부피, 분할에 관련된다. <계시자>에서 여자는 종종 고정되고 움직이지 않는 부정적인 점인 반면, 아이는 여자 주위, 침대 주위, 나무 주위를 돌고, 남자는 여자, 그리고 아이와의 관계를 지탱하는 반원들을 그린다. p.397-398
그의 신체는 여전히 삼의 이행 그 자체인 결정할 수 없음의 흔적을 지닐 것이다. 아마도 이 점에서 신체의 영화는 본질적으로 행동의 영화와 대립할 것이다. 행동-이미지는 목표와 장애물, 수단, 종속관계, 주된 것과 부차적인 것, 우위와 혐오가 배분되어 있는 공간을 가정한다. 즉 흔히 경로적 공간이라고 부르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체가 사로잡혀 있는 공간은, 감각-운동적 구조에 의해 정돈될 수 없는, 이질적인 집합들이 겹쳐 경쟁하고 있는 전혀 다른 공간이다. 이 집합들은 비록 서로 구별되고 양립 불가능하기조차 하지만, 이들을 서로 식별할 수단을 찾을 수 없도록 포개진 관점들 속에서 서로 접촉하고 있다. 이것은 아이 혹은 어릿광대 홋은 둘 다에 의해 끊임없이 사로잡혀 있는 행위 이전의 공간이다. 정신의 비결정이 아닌, 신체의 결정할 수 없음에 되돌려지는 마음의 동요와 같은 전-경로적 공간espace pre-hodologique인 것이다. 장애물은 행동-이미지에서처럼 집합을 단일화할 수단과 목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내에 현존하는 방식으로서의 복수성", 양립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존하는 집합들에 귀속되는 방식으로서의 복수성 속으로 산포된다. 두아이용의 힘은 이 전-경로적 공간, 겹쳐짐의 공간을 신체의 영화의 고유한 대상으로 삼았다는 데 있다. 그는 이 공간으로 인물들을 데리고 가서, 퇴행이 발견이 되는 공간을 창조한다(<방탕한 소녀>). 이렇게 해서 그는 단지 고전영화의 행동-이미지를 해체할 뿐만 아니라 비사유로서의 신체의 비-선택, 정신적 선택의 이면 혹은 전도를 발견한다. 바로 이것이 고다르의 <삶, 각자 알아서 구하라>에서 교환되는 대화의 의미일 것이다. '선택해.... 아니, 나는 선택하지 않아.... 선택해.... 아니, 나는 선택하지 않아....' p.399-400
대체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대 세계의 비참함을 특징짓는 고독과 소통 불가능성이라는 기존의 주제 속에서 안토니오니의 작품의 통일성을 찾으려 한다. 그렇지만 안토니오니 자신에 따르자면 우리는 아주 다른 두 걸음, 즉 신체를 위한 한 걸음과 두뇌를 위한 한 걸음으로 걷고 있다. 한 아름다운 텍스트에서 안토니오니는, 우리의 인식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갱신하고 거대한 변동에 맞닥뜨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반면, 우리의 도덕과 감정은 더 이상 어느 누구도 믿지 않는 신화나 적으으하기 어려운 가치들에 갇혀 있고,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초라하고 냉소적인 혹은 에로틱하거나 신경증적인 궁여지책만을 찾을 뿐이라고 설명한다. 안토니오니는 현대 세계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오히려 현대 세계의 가능성들을 깊이 '믿는다'. 그가 비판하는 것은 세계 내에서의 현대적 두뇌와 지치고 낡고 신경증적인 신체의 공존이다. 결국 그의 작품은 근본적으로 시간-이미지의 두 국면에 상응하는 이원론을 통과해간다. 신체에 과거의 모든 무게와 세계의 온갖 피로, 현대적 신경증을 부과하는 신체의 영화, 그리고 세계의 창조성, 새로운 시-공간을 통해 창출된 세계의 색채, 인공 두뇌에 의해 증식된 세계의 역량을 발견해내는 두뇌의 영화. 만약 안토니오니를 위대한 색채주의자라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은 그가 끊임없이 세계의 색을 믿었고, 또 이 색채를 창조하면서 우리의 두뇌적 인식을 갱신할 가능성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는 세계의 소통 불가능성에 신음하고 있는 작가가 아니다. 단지 세계가 눈부신 색채로 그려져 있는 반면, 그 안에 득실거리는 신체는 아직 칙칙하고 무채색일 뿐이라는 것이다. 세계는 자신의 거주자들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들은 아직 신경증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신체에 관심을 갖고, 신체의 피로와 신경증을 탐색하고, 그로부터 색채를 이끌어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안토니오니의 작품의 통일성은 인물-신체와 그의 피로, 과거의 대면, 색-두뇌와 그것의 미래적인 모든 잠재성과의 대면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 둘은 그러나 단 하나의 동일한 세계, 즉 우리의 세계, 그리고 이 세계의 희망과 절망을 구성하는 것이다.
안토니오니의 공식은 그에게만 유효한 것이고, 이를 발명한 사람은 바로 그 자신이다. 신체가 마모하도록 예정되어 있지 않듯, 두뇌 도한 새로움에 예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앞서 신체의 영화가 그렇게 했듯, 모든 역량들을 재결집할 두뇌의 영화가 갖고 있는 가능성이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두 스타일의 영화가 있다 할 것이고, 이것은 고다르적인 신체의 영화와 레네적인 두뇌의 영화, 혹은 캐서비츠적인 신체의 영화와 큐브릭적인 두뇌의 영화처럼 끊임없이 다양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신체 내의 사유만큼, 두뇌에는 쇼크와 폭력이 있다. 그리고 서로에는 또한 감정이 존재한다. 두뇌는 자신의 이상증식이라 할 신체를 통솔하려 하고, 신체는 자신이 일부분이라 할 두뇌를 통솔하려 한다. 이 두 경우에 동일한 신체적 태도, 동일한 두뇌적 게스투스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신체의 영화에 대한 두뇌의 영화의 특이성이 나온다. 큐브릭의 영화를 보면 우리는 얼마나 두뇌가 미장센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신체의 태도는 최대치의 폭력에 이르고 있지만, 여기에서 그 태도는 두뇌에 의존한다. 그것은 큐브릭에게 있어서 세계 자체가 이미 하나의 두뇌이며, <닥터 스트레인지러브>의 빛나는 거대한 원형 탁자, <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거대한 컴퓨터, <샤이닝>의 오벌룩 호텔처럼 세계와 두뇌의 동일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 2001>의 거석은 두뇌의 단계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상태들을 또한 주재한다. 그것은 지구, 태양 그리고 달이라는 세 물질의 영혼인 동시에, 짐승, 인간, 기계라는 세 두뇌의 배아이기도 하다. 만약 큐브릭이 통과의례적 여행이라는 주제를 새롭게 갱신했다면, 그것은 그의 영화에서 세계 내의 모든 여행은 두뇌의 탐색이기 때문이다. 두뇌-세계, 이것이 바로 <시계 태엽장치 오렌지>이며, 혹은 사망한 군인의 수와 쟁취한 지점들에 근거해 승진 가능성을 계산해보는 대령의 원형 체스놀이이다(<영광의 길>). 만약 계산이 틀리거나 컴퓨터가 고장난다면 그것은 세계가 합리적 체계가 아니듯 두뇌 역시 함리적 체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세계와 두뇌의 동일성, 즉 자동기계는 하나의 전체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안과 바깥이 접촉하게 하고 이 둘이 서로 현존하게 하며, 서로 대면하거나 대치하게 하는 한계 혹은 막을 형성한다. 안le dedans, 그것은 심리학, 과거, 함입, 두뇌를 파고 들어가는 모든 깊이의 심리학이다. 바깥le dehors, 그것은 성운들의 우주론, 미래, 진화, 세계를 폭발시키는 모든 초자연적인 것이다. 이 두 힘은 서로 끌어안고 교환하며 결국 그 한계에서 식별 불가능하게 되는 죽음의 힘들이다. <시계 태엽 장치 오렌지>의 알렉스의 미친 듯한 폭력은 미친 내부의 질서에 봉사하기 이전의 바깥의 힘이다.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 자동기계는 바깥에서 침투한 우주비행사에 의해 기능 정지되기 전, 내부에서 고장난다. 그리고 <샤이닝>에서, 무엇이 안으로부터 오고 또 무엇이 바깥으로부터 오는지, 그것이 초감각적인 지각인지 혹은 환각적 투영인지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뇌-세계는 두 방향 사이의 막을 침투하는 죽음의 힘으로부터 엄격히 분리될 수 없다. 안과 바깥에 평화를 놓을, 그리고 천체의 조화 속에서 하나의 전체로서의 뇌-세계를 재창조할 막의 재생과 같은 화해가 또 다른 차원에서 일어나지 않는 한 말이다.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끝은 사차원의 질서에 의해 태아의 원과 지구의 원이 죽음을 새로운 삶으로 역전시킬, 미지의 공약 불가능한 새로운 관계로 들어갈 기회를 갖게 된다. p.402-405
뇌와 세계의 동일성, 이것이야말로 <사랑해 사랑해>의 정신세계라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것은 또한 끔찍한 유태인 포로수용소의 기구일 수도 있으며 국립 도서관의 우주-정신적인 구조일 수도 있다. 이미 레네에게 이러한 동일성은 하나의 전체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상대적인 안과 바깥을 서로 소통하고 교환하게 하는, 그리고 이들이 서로 접촉하고 상대방으로 연장되어 반향되게 하는 분극화된 막의 층위에서 나타난다. <스타비스키>의 절반의 뇌들처럼, 전체가 아닌 오히려 두 지대와 같은 것이, 더 이상 대칭적이거나 동시적이기를 그치는 만큼 더욱 잘 소통하고 접촉하는 것이다. <섭리>에서 폭탄은 사방에 단골음을 내는 늙은 술주정뱅이 소설가의 신체 상태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천둥과 번개의 우주적 상태, 그리고 기관총과 속사포의 사회적 상태 속에 있다. 안과 바깥이 서로 현존하도록 하는 이 막은 바로 기억이라 불리는 것이다. 기억이 레네의 명백한 주제임은 분명하지만, 더 미묘한 문제라 할 잠재적 내용을 찾을 필요는 없을 것이며, 레네를 통해 어떻게 기억이라는 개념이 변화를 겪게 되었는지(프루스트, 혹은 베르그손에 의해 이루어진 변화만큼이나 중요한)를 평가하는 것이 더 가치 잇는 일일 것이다. 왜냐하면 기억은 더 이상 추억들을 갖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기억은 아주 다양한 양태(연속성뿐만 아니라 불연속성, 감싸기 등을 포함하는)로 과거의 시트들과 현실의 지층들을 소통하게 하는 막과 같은 것으로서, 전자는 항상 이미 거기 있는 안으로부터 발현하는 것이고 후자는 항상 이제 와야 할 바깥으로부터 도래하는 것으로서, 이 둘은 모두 그들이 만나는 지점인 현재를 침식한다. 이 주제는 이미 앞서 분석된 것이다. 만약 신체의 영화가 무엇보다도 직접적인 시간-이미지의 한 양상, 즉 이전과 이후를 따르는 시간의 계열serie du temps에 귀착된다면, 두뇌의 영화는 또 다른 양상, 즉 자신의 고유한 관계들의 공존성에 따른 시간의 질서ordre du temps를 발전시킨다 할 것이다.
그런데 기억이 내부들과 외부들처럼 상대적인 안과 바깥들을 소통하게 한다면, 절대적인 안, 그리고 절대적인 바깥 역시 서로 대면하고 공존해야 할 것이다. 르네 프레달은 아우슈비츠와 히로시마가 얼마나 레네의 전 작품의 지평을 점하고 있는지, 그리고 레네의 주인공이, 케이롤이 유태인 포로수용소와의 본질적 관계 속에서 누보 로망의 정신으로 삼았던 '라자르적 주인공' *역주 3) '라자르'란 성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마리 마들렌느)의 동생 '나자로'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나자로는 죽은 지 4일 만에 예수에 의해 무덤에서 살아 돌아온다. 이 '라자르적 주인공' 혹은 '라자르적 인물'이라는 말이 서구 정신사에서 문제적이 된 것은 2차대전 후 서구 유럽인들의 의식을 지배했던 아우슈비츠의 경험이다. 많은 작가들이 이를 '라자르'란 상징적 인물을 통해 표상했는데, 특히 알랭 레네의 <밤과 안개>의 저자였던 장 케이롤 -실제로 2차대전 중 레지스탕스로 활동하다 나치의 유태인 포로 수용소에 수용된 후 살아 돌아온- 이 자신의 저서에 "라자르적인 문학"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아우슈비츠 이후의 인간, 아우슈비츠 이후의 문학을 지칭함으로써 유명해졌다. 말로 역시 자신의 저서 [연옥의 거울]의 한 장의 제목을 '라자르'라 붙이기도 한다. 들뢰즈 또한 자신의 저서와 인터뷰에서 이 극한의 경험과 그에 대한 저항의 상징적 인물로서 프리모 레비와 그의 저서들을 자주 언급하고 있다.* 에 얼마나 근접해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레네 영화의 인물은 정확히 라자르적이다. 왜냐하면 그는 죽음으로부터, 죽음의 나라로부터 되돌아왔기 때문이다. 그는 죽음을 통과했고, 죽음의 감각-운동적 혼란을 간직한 채 죽음으로부터 태어났다. 비록 그가 실제로 아우슈비츠나 히로시마에 있지 않았다 할지라도 말이다.... 그는 임상적 죽음을 통과했고, 가시적인 죽음으로부터 태어났거나 죽은 자들로부터, 즉 아우슈비츠, 히로시마, 게르니카, 혹은 알제리 전쟁으로부터 돌아왔다. <사랑해 사랑해>의 주인공은 단지 자살한 것만이 아니라, 죽은 자들을 항상 익사된 자들로 만들어버리는 밤과 진흙의 늪, 간조와도 같은 사랑하는 여인 카트린을 소청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스타비스키>의 한 인물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기억의 시트들을 넘어, 이것들을 섞는 낮은 소리, 어떤 절대적인 것을 형성하는 이 내부로부터의 죽음이 존재하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사람은 바로 이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이해하자. 그리고 벗어난 사람,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사람은 이제 피할 수 있는 여지없이 그에게 절대의 다른 얼굴처럼 다가오는 바깥의 죽음을 향해 간다. <사랑해 사랑해>는 안, 즉 그가 그로부터 되돌아오는 안의 죽음과, 그에게 닥치는 바깥의 죽음, 이 두 죽음을 일치시킨다. 우리가 보기에 영화사상 가장 야심적인 작품 중의 하나인 <죽음에 이르는 사랑>은 주인공이 되살아나는 임상적 죽음에서 그가 다시 떨어지게 될 결정적인 죽음으로, 즉 이 양자를 분리하는 '조금 깊은 시내'로 이행한다. 죽음에서 또 다른 죽음으로, 모든 과거의 시트들보다 더 깊은 안, 모든 외부 현실의 지층들보다 더 먼 바깥, 이 절대적 안과 밖이 접촉한다. 이 둘 사이, 둘-사이 속에서, 우리는 뇌-세계를 한 순간 빼곡하게 채우고 있는 좀비들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레네는 "자신이 보여주는 존재들의 환영적 성격을 유지하고, 한 순간 우리의 정신 세계에 개입하도록 예정된 유령들의 사교계 내에 이 존재들이 존속되도록 한다. 이 추위를 타는 주인공들은 (...) 무엇보다도 두터운 옷을 차려입고 시간의 밖에 존재하고 있다". 레네의 인물들은 단지 아우슈비츠나 히로시마로부터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또한 다른 방식으로 철학자들, 사유자들, 사유의 존재들이다. 왜냐하면 철학자들은 죽음을 겪은 인간, 죽음으로부터 태어난 인간, 그리고 어쩌면 동일한 죽음일 수도 있을 또 다른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인간들이기 때문이다. 아주 유쾌한 한 단편에서 폴린느 하비는, 자신은 철학에 대해 아무 것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아주 철학자들을 좋아하는데 그것은 이들이 그녀에게 다음과 같은 이중의 인상을 주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철학자들은 자신이 죽었다고, 죽음을 통과했다고 믿는 인간들이다. 또한 자신은 비록 죽었지만, 그러나 냉기 속에서 떨며, 피로와 조심성을 갖고 살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믿는 인간들이다. 폴린느 하비에 따르면 이것은 그녀를 실소하게 만드는 이중적인 착오이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에, 비록 그녀를 다시 한번 실소하게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이중적인 진실을 함축하고 있는 것 같다. 우선 철학자들은 옳건 그르건 자신이 죽은 자들 사이에서 되돌아온 자라고 믿는 자이며, 또한 아주 정당하게도 죽은 자들에게로 되돌아가는 자이다. 철학자는 죽은 자들로부터 되돌아와 다시 그리로 돌아간다. 이것은 실상 플라톤 이래 철학의 살아 있는 공식이었던 것이다. 우리가 레네의 인물들을 철학자들이라 할 때, 물론 이 인물들이 철학에 대해서 말한다거나 레네가 영화에 철학적 사유를 '적용한다ㅏ'는 의미가 아니라,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공동 작업자와 함깨 영화와 철학의 드문 결합을 성취하면서, 영화사상 완전히 새로운, 그리고 철학사상 완전히 살아 있는 철학의 영화, 사유의 영화를 창조했다는 의미이다. 사유가 아우슈비츠 혹은 히로시마와 더불어 봐야 할 것이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전후의 위대한 철학자들과 작가들, 그리고 웰스에서 레네에 이르는 위대한 영화 작가들이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심각한 방식으로 말이다. p.405-409
상사성과 인접성은 한 이미지에서 다른 이미지로 이행해가는 방식을 결정한다. 이 두 축은 이미지와 개념의 동일성에 도달하기 위해, 견인의 원칙에 따라 서로 의존한다. 실상 전체로서의 개념은 일련의 연합된 이미지들 속에서 외재화되지 않고서는 분화될 수 없고, 이미지들은 자신을 통합하는 전체로서의 개념 속에서 내재화되지 않고는 서로 연합할 수 없다. 바로 여기에서 고전적 재현을 움직이는 조화로운 총체로서의 앎의 이상이 나오게 된다. 전체가 갖는 근본적인 열린 성격조차 이러한 모델을 위반하기는 커녕 오히려 사실은 그와 반대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주어진 이미지들을 연장하고 뛰어넘는, 그러나 동시에 이미지들의 연장 가능한 연속들을 통합하는 변화하는 전체를 표현하는 연합 가능성을 화면 밖 영역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다(화면 밖 영역의 두 측면). 우리는 영화적 헤겔이라 할 에이젠슈테인이 어떻게 이러한 개념화에 대한 거대한 종합을 보여주었는지를 알고 있다. 공약가능성과 견인으로 이루어진 열린 나선 구조가 그것이다. 에이젠슈테인 자신 또한 이 모든 종합을 움직이고 있는 뇌의 모델, 그리고 영화를 뛰어난 두뇌의 예술, 세계-두뇌의 내적 독백으로 만드는 뇌의 모델을 숨기지 않았다. "몽타주의 형식은 사유의 과정의 법칙을 재복구하는 것이며, 역으로 사유는 전개되고 있는 움직이는 현실을 재건하는 것이다." 이것은 두뇌가 바로 통합-분화의 수직적 조직인 동시에 연합의 수평적 조직이기도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뇌와 우리의 관계는 오랫동안 이 두 축을 따라 전개되었다. 아마도 베르그손이야말로 그 변화에 대해 하나의 심각한 요소를 도입한 사람이라 할 것이다. 즉 두뇌란 자극과 반응 사이의 차이, 비어있는 틈새 그 외의 어느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발견이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 차이란 거기에 구현된, 차이를 넘어서는 연합으로서의 통합하는 전체에 종속되어 있었다. 다른 영역에서, 언어학은 통합체와 계열체의 관점(통합-분화)뿐만 아니라, 은유와 환유의 관점(상사성-인접성)을 통해 고전적인 두뇌의 모델을 견지했다고 할 것이다. p.411-412
다른 한편으로, 연합의 과정은 점점 더 뇌의 연속적 조직망에 존재하는 단절들, 그리고 단지 뒤어넘어야 할 빈 공간만이 아니라 연합적 메시지의 수신과 발신 사이에 매순간 틈입하는 우연적 메커니즘으로서의 미시적 틈들을 도처에서 만나게 되었다. 바로 이것이 확률적, 혹은 준-우연적 뇌 공간, '불확실한 시스템'의 발견이다. 어쩌면 우리는 이 두 측면에 의해 탈중심적인 체계로서의 뇌를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우리와 뇌의 관계의 변화는 과학의 영향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역, 즉 먼저 우리와 뇌의 관계가 변화했고 이것이 어렴풋하게 과학을 이끈 것이라 할 수 있다. 심리학은 체험과 신체의 관계, 체험된 신체에 대해서는 무수히 얘기하지만 체험된 뇌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지 않는 것 같다. 우리와 뇌의 체험적인 관계는 점점 더 깨지기 쉽고 점점 덜 '유클리드적'인 것이 되어가면서, 아주 미시적인 뇌의 죽음들을 통과해간다. 뇌는 이제 우리의 통제, 해결 혹은 결정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문제, 우리의 병 혹은 정열이 되었다. 아르토를 모방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르토는 뇌에 대해 우리 모두에 연관된 어떤 문제를 체험했던 것 같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한 뇌의 안테나", "죽음으로부터 거듭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뇌의 능력.
이제 우리는 설사 그것이 열린 것이라 할지라도 사유의 내재성으로서의 전체를 더 이상 믿지 않는다. 우리가 믿는 것은 움푹 파여 벌어진, 우리를 덥석 물고, 내부를 끌어당기는 바깥의 힘이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미지들의 연합을 믿지 않는다. 비록 그것이 빈 틈새들을 극복했다 할지라도 말이다. 우리가 믿는 것은 절대적 가치를 갖는, 그리고 모든 연합을 종속시켜버린 단절이다. 이거은 추상이 아니라, 새로운 '지적'영화를 정의하는 두 국면이다. 우리는 특히 이를 테시네와 브누아 자코의 영화에서 볼 수 있다. 현대영화가 감각-운동의 붕괴 위에 구성되었다면, 이 두 작가는 이를 획득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을 신체의 영화로부터 구분했는데, 그것은 그들이 (레네에게도 마찬가지로) 신체의 태도에 명령을 내리는 것은 무엇보다 두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뇌는 모든 내적 연합들을 자르거나 탈주하게 하고, 모든 외적 세계를 넘어 바깥을 소환한다. 테시네에게 연합된 이미지들이란 인물이 그를 부르는, 그러나 어저면 그가 조우할 수 없을 바깥을 향해 가기 위하여 거슬러올라가야 하는 흐름을 쫓아 유리창 위로 미끄러져 달아난다(<바로코>의 배, <미국 호텔>). 이와는 반대로 자코의 영화에서 절대적 바깥이라는 유일한 한계를 갖는 한없는 해석에 대체된 연합을 깨뜨리는 것은 이미지의 문학적 기능(아첨, 중복, 동어반복)이다(<음악가 암살자> <벽장의 아이들>). 이 두 경우는 모두 신-정신분석학적 영감을 보여주고 있다. 나에게 오류, 실수를 달라, 그러면 그것으로 뇌를 재구성하겠다. 이것은 안과 바깥의 위상학적 구조이다. 또한 새로운 뇌적 이미지를 정의하는 것은 연쇄 혹은 명상의 각 단계의 우연적 성격이다. p.412-413
그러므로 더 이상 은유 혹은 환유에 의한 연합이 아닌, 문자적 이미지 상에서의 재-연쇄가 존재한다. 또 더 이상 연합된 이미지의 연쇄가 아닌, 독립적인 이미지들의 재-연쇄만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한 이미지 다음 또 다른 이미지가 아닌, 한 이미지 더하기 다른 이미지. 그리고 각 쇼트는 다음 쇼트의 프레임화와의 관계를 통해 탈프레임화된다. 우리는 이미 이것을 고다르의 틈새적 방법을 통해 상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것은 더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브레송, 레네, 자코 그릭 테시네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재-연쇄된 단편화이다. 이것은 전혀 새로운 리듬이며, 계열적 혹은 무조건적인 영화 새로운 개념의 몽타주이다. 절단은 이제 검은 스크린, 흰 스크린 그리고 이것들의 파생물 혹은 조합처럼 그 자체로 연장되고 표현될 수 있다. 레네의 <죽음에 이르는 사랑>에서 끊임없이 되돌아 오는, 작은 깃털들 혹은 빠른 입자들과 그것의 다양한 배분을 보랏빛으로 물들이는, 거대한 푸른 밤의 이미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편으로 영화 이미지는 공약 불가능한 관계와 무리수적 절단에 의해 시간의 직접적 현시가 된다. 그리고 다른 한 편으로, 이 시간-이미지는 환기할 수 없음, 설명할 수 없음, 결정할 수 없음, 공약 불가능함과 같은 비사유가 사유와 관계 맺도록 한다. 바깥 혹은 이미지의 이면이 전체를 대체함과 동시에 틈새 혹은 절단이 연합을 대체하게 되는 것이다. p.416
미국영화와 소비에트 영화에서 민중은 현실화되기 이전 이미 현실적인 것으로서, 추상적이지 않은 이상적인 것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대중예술로서의 영화가, 민중이 진정한 주체가 되는 탁월한 혁명예술 혹은 민주적 예술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나오게 된다. 그러나 많은 요소들이 이러한 믿음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주체로서의 대중이 아닌 노예적인 대중을 영화의 대상으로 삼은 히틀러의 도래, 민중의 일체성을 당의 전제적 단일성으로 대체한 스탈린주의, 더 이상 스스로를 과거의 민중들이 응집하는 도가니나, 장차 올 민중의 어린 배아로서 믿을 수 없게 된 미국 민중의 해체(심지어 뉴-웨스턴조차도 혹은 무엇보다도 뉴-웨스턴이 이러한 해체를 보여주고 있다 할 것이다). 간단히 말해 현대적인 정치영화가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다음과 같은 기저 위에서일 것이다. 민중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혹은 아직 없다... . 민중이 결여되어 있다.
아마도 이러한 진실은 서구에 또한 유효할 것이다. 그러나 이 진실을 발견한 작가는 많지 않은데, 그것은 이 진실이 권력의 메커니즘 및 다수가 만든 체계에 의해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억압되고 착취당한 국가들이 집단적 정체성의 위기와 함꼐 지속적으로 소수집단의 상태에 머눌러 있는 제3세계에서 이러한 진실은 폭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었다. 제3세계와 소수집단들은 그들의 국가와 또 이 국가 내에서의 자신들의 상황과 관련하여 민중, 그것이야말로 결여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작가들을 낳았다. 카프카와 클레는 이를 명시적으로 선언했던 최초의 작가들이다. 카프카는 "약소 국가에서의" 소수문학은 "종종 무력한, 그리고 끊임없이 해체되어가고 있는 국가 의식"을 대체해야만 하고, 부재한 민중의 집단적 과업을 완수해야 한다고 말한다. 클레는 회화란 그 자신의 "걸작"을 이루는 모든 부분들을 결집하기 위해 "마지막 힘", 즉 아직 결여되어 있는 민중을 원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것은 대중예술로서의 영화에는 더 말할 나위 없이 유효한 것이다. 때로 제 3세계의 시네아스트들은 미국, 이집트 혹은 인도의 시리즈물과 가라데 영화에 빠져 있는, 대체로 문맹상태인 민중과 대면하게 되는데, 아직은 결여되어 있는 민중이라는 요소를 이로부터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바로 여기를 통해 가야 하고, 이 질료와 함께 작업해야만 하는 것이다. 또 때로 소수집단의 시네아스트는 카프카가 묘사한 다음과 같은 막다른 골목과 맞닥뜨리게 된다. '쓰지' 않을 불가능성, 지배적인 언어로 써야 하는 불가능성, 다르게 쓸 수 있는 불가능성(피에르 페로는 <양식 없는 나라>에서 바로 이러한 상황, 즉 말하지 않을 불가능성, 영어 아닌 다른 말로 말할 불가능성, 영어를 말할 불가능성, 불어를 하기 위해 프랑스에 자리잡을 불가능성...을 재발견한다). 그러나 바로 이 위기상황을 통과해야 하고, 이를 해결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재하는 민중에 대한 보고서는 정치적 영화의 포기가 아니라, 그와는 반대로 제3세계와 소수집단들이 이제부터 정초해나가야 할 새로운 기초를 이룬다. 예술, 그리고 특히 영화는 이러한 과업에 무엇보다도 참여해야 한다. 이미 존재한다고 전제된 민중에 말을 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민중의 창조에 기여할 것. 주인, 식민 지배자들이 '여기에는 결코 민중이란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순간에, 결여된 민중은 하나의 생성이 되고, 이 민중은 판자촌과 수용소, 혹은 게토, 즉 당연히 정치적인 예술이 헌신해야 할 새로운 투쟁의 조건 속에서 스스로를 창조하게 되는 것이다.
고전적 정치영화와 현대적 정치영화 사이의 두 번째 커다란 차이점은 정치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관계에 관련된 것이다. 카프카는 '다수'의 문학은 비록 유동적이긴 해도 항상 정치적인 것과 사적인 것 사이의 경계를 유지하려 하는 반면, 소수문학에서 사적인 문제는 즉각적으로 정치적인 것이고, "삶이냐 혹은 죽음이냐의 생사를 거는 선고를 초래한다"고 시사적으로 말했다. 또한 사실, 강대국에서의 가족, 부부, 혹은 개인 그 자체는, 비록 그들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사회적 모순과 문제들을 표현하고 또는 직접적으로 그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항상 그 자체에 속한 고유한 문제만을 산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적인 요소란 그 원인으로 거슬러 올라가거나, 그것이 표현하는 '대상'을 발견하는 한에서만 의식화의 거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고전영화는 정치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상호관계를 드러내고, 의식화라는 중계를 통해 하나의 사회적 권력에서 다른 권력으로, 하나의 정치적 위상에서 다른 위상으로 이행해가기를 허용하는 경계를 끊임없이 유지하였다. 예를 들어 푸도프킨의 <어머니>는 아들의 진정한 투쟁 대상을 발견하고 이를 게승하려 한다. 포드의 <분노의 포도>에서 어느 순간까지 사태를 분명히 바라보는 것은 어머니이다. 그리고 상황이 변하자 이제 아들이 그 뒤를 잇는다. 현대영화에서 사정은 이제 더 이상 동일하지 않다. 현대영화에는 최소한의 거리 혹은 진보를 보증해줄 어떤 경계도 남아있지 않다. 사적인 문제는 즉각적으로 사회적인 혹은 정치적인 것과 섞인다. 귀니의 <욜>의 가족 집단은 아주 긴밀하게 밀착된 유대와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어, 한 인물은 죽은 형의 아내와 결혼해야 하고, 또 다른 인물은 멀리 눈 덮인 벌판을 지나 죄를 지은 자신의 아내를 찾으러 가서, 그녀가 처벌받아야 할 곳에서 그녀를 처벌한다. 또한 <욜>과 마찬가지로 <무리>의 가장 진보적인 주인공은 이미 사형이 선고되어 있다. 어쩌면 시대착오적인 시골 가족의 문제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전선', 즉 옛것에서 새것으로의 진보라든지, 둘 사이의 비약을 이끄는 혁명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남미의 영화에서처럼, "어떤 부조리를 형성하고" "일탈적인 형태"를 취하는 옛것과 새것의 병치 또는 상호침투가 존재하는 것이다. 정치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의 상호관계를 대체하는 것은, 부조리에 이를 만큼 아주 다양한 사회적 단계들의 공존이다. 이렇게 글로버 로샤의 작품에서 민중의 신화, 예언, 그리고 산적 등은 마치 민중이 자신들이 다른 곳에서 겪은 폭력을 바로 자신으로 되돌려 경배의 욕망 속에서 되풀이하고 있기라도 하듯, 자본주의의 폭력에 대한 시대착오적 이면을 드러낸다(<검은 신, 흰 악마>). 의식화는 그 가치를 상실하는데, 그것은 의식화란 때로 지식인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듯 사상누각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자들의 안토니오에서처럼, 나란히 병치되어 있는 두 폭력과 이들의 지속을 단지 포착하기만 하는 공허함 속에 억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남아 있는가? 아직 만들어내지 못한 가장 위대한 '선동' 영화. 선동은 이제 더 이상 의식화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 내에 사적인 문제가, 그리고 사적인 것 내에 정치적인 문제가 통과하게 하면서 동싱에 폭력들이 서로 소통하게 하기 위해 민중과 주인, 카메라조차 도취상태에 놓고, 이 모두를 일탈로까지 몰고 가는 것, 바로 여기에 있다(<도취된 땅>). 여기서 로샤 영화에 나타나는 신화비판이 갖는 아주 특별한 측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즉 신화의 의미 혹은 그것이 갖는 시대착오적 구조를 드러내기 위해 신화를 분석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시대착오적인 신화를 완전히 현재적인 사회의 충동 상태, 즉 기아, 갈증, 성욕, 권력, 죽음, 경배와 관련시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아시아에서는 브로카의 작품에서 신화의 형태 아래 존재하는 동물적인 충동과 사회적 폭력의 즉각성을 재발견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후자가 전자보다 더 '문화적'이지 않듯 전자 또한 후자보다 더 '자연적'이지 않다. 살아가는 것의 불가능성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는 체험된 현재성을 신화로부터 이끌어낼 것, 이것은 물론 다른 방식을 취할 수 있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정치적 영화의 새로운 대상을 구성한다. 즉 도취와 위기상태에 놓을 것. 피에르 페로에게는 도취가 아닌 위기상태가 문제이다. 동물적 충동이 아닌 끈질긴 탐색이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의 선조들에 대한 일탈적인 탐구(<낮의 지배> <양식이 없는 나라> <브르타뉴 지방의 퀘벡 인이었습니다>)는 그 자신, 기원의 신화의 형태 아래 사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 사이의 경계의 부재뿐만 아니라, 각 방향 모두에서 막다른 골목에만 직면하게 된느 식민지 주민에게 이 조건들 속에서 사는 불가능성을 보여준다. 모든 것은 마치, 현대의 정치 영화는 고전영화와 달리 진화와 혁명의 가능성 위에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카프카 식의 불가능성, 즉 참을 수 없음 위에 구성되기라도 하는 것 같다. 서구의 작가들 또한 허울 좋고 명목뿐인 혁명적 민중으로 귀결되지 않는 한 이러한 막다른 골목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조건이 바로 코몰리가 다음과 같은 이중의 불가능성, 즉 그룹을 이룰 불가능성과 그룹을 이루지 않을 불가능성, "그룹을 피할 불가능성과 그것에 만족할 불가능성" 속에서 작업하게 하면서, 그를 진정한 정치적 시네아스트로서 만든 조건인 것 같다(<붉은 그림자>)
만약 민중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리고 더 이상 의식도, 진화도, 혁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전복의 도식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다. 이제 더 이상 프롤레타리아나 단결된 혹은 통합된 민중에 의한 권력의 쟁취란 가능하지 않다. 물론 제3세계의 가장 위대한 시네아스트들은 어느 한 순간 그 가능성을 믿었다. 로샤의 체 게바라주의, 샤인의 낫세르주의, 미국 흑인영화의 블랙 파워주의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이 작가들이 여전히 고전적인 개념 속에서 참여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측면이기도 하다. 그만큼 과도적인 과정은 느리고 잘 감지할 수 없으며 분명히 자리매김하기 어렵다. 의식화에 조종을 울린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민중이 없다는, 그러나 여전히 통합해야 할 다수의 민중, 혹은 한없는 민중이 존재한다는 의식, 혹은 더 나아가, 문제가 진정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민중을 단일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한 의식화이다. 바로 이를 통해 제3세계의 영화는 소수집단의 영화가 되는데, 그것은 민중이란 소수 상태로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바로 그러한 이유로 민중은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소수집단 속에서 사적인 문제는 즉각적으로 정치적인 것이 된다. 전제적인 통일성을 재건할 수도, 다시 새로이 민중을 배반할 수도 없을, 융합 혹은 통합의 실패를 확인하면서, 현대의 정치영화는 파편화와 파열 위에 구성되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차이점을 이루는 것이다. 70년대 이후, 미국의 흑인영화는 게토로 회귀하고 의식화의 이 편으로 거슬러올라가, 흑인의 부정적 이미지에 긍정적 이미지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유형과 '성격'들을 복수화하고, 더 이상 행동의 연쇄에 상응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순수한 음향과 시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감정적 상황 혹은 깨어진 충동의 상황에 상응하는 이미지의 작은 부분만을 창조 혹은 재창조한다. 이 때 흑인영화의 특이성은 "매체 그 자체를 향한 투쟁"이라는 새로운 형식에 의해 정의된다(찰스 버네트, 로버트 가드너, 헤일 제리마, 찰스 레인). 이것은 또 다른 방식으로 아랍 영화에서 샤인의 구성방식이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 <왜 알렉산드리아인가?>는 시작부터 서로 뒤엉켜 유인하는 다수의 선들을 드러내는데, 그 중 하나는 주된 선을 이루고(소년의 이야기), 다른 선들은 이 주된 선과 다시 교차될 때까지 유인된다. 그리고 <기억>에는 이 주된 선조차 더 이상 온존되지 않고 다양한 흐름들을 따라가는데, 이 흐름들은 결국 일종의 왜 나인가?와 같은 내적 심판과 선고, 그러나 이 내부의 동맥들이 즉각적으로 외부의 선들과 접촉하는, 작가의 심장 발작으로 귀결된다. 샤인의 작품에서 '왜'라는 질문은 고다르 작품에서의 '어떻게'라는 질문만큼이나 순수하게 영화적인 가치를 갖는다. 왜? 이것은 내부의 질문, 나의 질문이다. 왜냐하면 만약 민중이 부재한다면, 그리고 이 민중이 소수자들로 산포되어 있다면, 바로 나 자신이 무엇보다도 민중, 카르멜로 베네가 말했던 내 원자들의 민중, 샤인이 말한 내 동맥들의 민중이기 때문이다(제리마는 그 자신, 만약 흑인 '운동'의 복수성이 존재한다면 각 시네아스트는 그 자체 즉자적으로 운동이라고까지 말한다). 그러나 왜? 이것은 또한 바깥의 질문, 세계의 질문, 부재함으로써 스스로를 창조하는 민중의 질문, 내가 그에게 제기하는 질문을 바로 나에게 제기함으로써(알렉산드리아-나, 나-알렉산드리아0 스스로를 창조할 기회를 갖는 민중의 질문이기도 하다. 제3세계의 많은 영화들은 암시적이건, 혹은 페로의 <다음 세계를 위하여>, 샤인의 <기억>, 흘레피의 <풍요로운 기억>처럼 제목을 통해 명백히 명시화하건, 기억의 문제를 소환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것은 추억을 환기하는 능력으로서의 심리적 기억이나 존재하는 민중의 기억과 같은 집단적 기억이 아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여기서 기억은 안과 바깥, 민중의 문제와 사적인 문제, 결여하고 있는 민중과 부재하는 내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이상한 능력, 어떤 막, 이중적인 생성이라 할 수 있다. 카프카는 이미 약소국가들에서 이러한 기억이 가질 수 있는 역량에 대해 말한 바 있다. "한 약소국가의 기억이 한 강대국의 기억보다 더 짧은 것은 아니다. 기억은 여기서 훨씬 더 깊숙이 존재하는 물질들과 작업하고 있다." 기억은 공간적 연장으로서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깊이와 원경으로 획득한다. 기억은 더 이상 심리적인 것도 집단적인 것도 아닌데, 그것은 '작은 나라'에서 각자는, 비록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거나 혹은 그것을 지지하지도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몫만을 상속하고 이 몫 이외의 어떠한 대상도 갖지 않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교환되는 파편적 세계와, 지친 나를 통한 세계와 나의 소통. 세계의 모든 기억은 억압된 각 민중 위에 착지해 있고, 나의 모든 기억은 유기적인 위기 속에서 작동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속한 민중의 동맥들, 혹은 내 동맥의 민중... .p.420-427
카프카가 문학에 제안한 것은, 영화란 바로 자신을 통해 집단적 조건들을 결집시킨다는 점에서, 더더욱 영화에 유효한 것 같다. 그리고 실상 이것이 바로 현대의 정치영화가 갖는 마지막 성격이기도 하다. 영화 작가는 문화의 관점에서, 이중적으로 식민화된 민중에 직면해 있다. 바깥으로부터 온 역사들에 식민화됐을 뿐만 아니라, 식민주의자에 봉사하기 위해 익명화된 실체가 되어버린 자기 자신의 신화에 의하여 식민화된 민중. 작가는 그러므로 자신의 민중의 민족지학자가 되어서는 안되며, 마찬가지로 사적 이야기에 불과할 어떤 허구를 만들어내서도 안된다. 왜냐하면 모든 사적 허구들은 모든 익명적 신화와 마찬가지로 '주인'의 편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렇게 로샤는 내부로부터 신화를 해체했고, 페로는 한 작가가 창조할 수 있을 모든 허구를 고발한다. 작가에게 남은 것은 스스로에게 '중계자'의 역할을 부여할 가능성, 즉 허구적이지 않은 실제 인물을 취해 그들을 '허구화'하고, "전설을 만들'고," 얘기를 꾸며내게' 해야 할 상황의 가능성이다. 작가는 자신의 인물들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야 하고, 인물들 역시 작가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 이것은 이중적인 생성이다. 이야기 꾸며대기는 익명적인 신화도 아니고, 개인적 허구는 더더욱 아니다. 이는 사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것을 분리하는 경계를 끊임없이 뛰어넘는, 그리고 그 자신, 집단적 언표들을 생산해내는 인물의 행동하는 발화, 발화의 행위이다.
다네는 아프리카 영화(그러나 이것은 또한 모든 제3세계 영화에 유효하다)란 서구가 바라는 것처럼 춤추는 영화가 아니라 말하는 영화, 발화 행위로서의 영화라고 주목한 바 있다. 아프리카 영화는 바로 이를 통해 민속학으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또 허구로부터 벗어난다. 우스만 셈벤은 <세도>에서 살아 있는 말의 토대가 되고 그것의 자유와 유통을 보장하며, 말에 이슬람 식민주의자들의 신화와 대립하는 집단적 언표의 가치를 부여하는 이야기 꾸며대기fabulation의 힘을 이끌어낸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로샤가 브라질의 신화에 대해 행했던 것이 아닌가? 그 내부적 비판은 우선적으로 참을 수 없음, 살 수 없음, '이' 사회 속에서 현재, 사는 것의 불가능성이라 할 수 있을 현재적 체험을 신화의 형태 속에서 추출해내는 것이다(<검은 신, 흰 악마> <도취된 땅>). 다음으로, 이 살기 어려움조차 침묵시킬 수 없는 발화 행위, 신화로의 회귀가 아닌, 비참을 이상한 긍정성, 즉 민중의 창조로 고양시킬 수 있는 집단적 언표의 생산이라 할 이야기 꾸며대기의 행위를 이끌어내는 것이 문제이다(<사자들의 안토니오> <칠두 사자> <단두>). 도취, 도취상태에 놓는다는 것은 과도기, 이행 혹은 생성이다. 바로 이것이 식민주의자의 이데올로기, 식민지인의 신화, 지식인들의 담론을 통과하여 발화 행위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부분들은 로샤의 영화에서 아직은 정확히 실재적인 것이 아닌, 재구성된 것이다(셈벤의 영화에서 또한 부분들은 17세기로 거슬러올라가는 한 이야기 속에서 재구성된다). 미국의 다른 한 끝에서 페로는 모든 허구를 경계할 뿐만 아니라 신화에 대한 비판을 행하기 위해 실제 인물들, 즉 자신의 '중계자'들에게 말을 건넨다. 위기화를 통해 나아가면서, 페로는 때로 행동의 모선이 되고(<다음 세계를 위하여>에서 돌고래잡이의 재창조), 때로는 자신이 대상이 되거나(<낮의 지배>에서 선조들에 대한 탐색), 혹은 창조적 모방을 행하는(<빛나는 짐승>에서 원본 사냥), 이야기를 꾸며대는 발화 행위를 이끌어내는데, 이 경우 이야기 꾸며대기는 항상 그 자체 기억이 되고 기억은 한 민중의 창조가 된다. 아마도 모든 수단들을 결집하는 <수목 없는 대지의 나라>와 함께, 혹은 그와는 반대로 모든 수단들을 희소화시키는 <양식 없는 나라>와 함께(왜냐하면 여기서 실제 인물은 극단적인 고독 속에 있고, 퀘벡에조차 속하지 않는, 영어권 나라에서의 아주 작은 소수인 불어 사용집단에 속할 뿐이며, 그래서 자신의 퀘벡적인 귀속성을 더 잘 꾸며내고 그로부터 집단적 언표들을 생산하기 위해 위니펙에서 파리로 날아가기 때문이다) 위의 내용은 정점에 이르는 것 같다. 과거의 민중의 신화가 아닌, 장차 올 민중에 대한 이야기 꾸며대기가 문제이다. 발화 행위는 바로 지배 하에서 사는 불가능성을 표현하기 위해 지배적인 언어 내에서 이방의 언어처럼 창조되어야 한다. 실제 인물은 이렇게 자신의 사적 상태로부터 벗어나고 동시에 작가는 자신의 추상적 상태로부터 벗어나, 둘이서, 여럿이서, 퀘벡, 미국, 영국 그리고 파리에 대한 퀘벡의 언표들을 형성한다(자유간접화법). 아프리카에서의 장 루쉬의 영화에서 <신들린 제사장들>의 도취는, 실제 인물들이 이야기를 꾸며댐으로서 타자가 되고, 또 작가 그 자신은 자신에 실제 인물들을 증여함으로써 타자가 되는 이중적인 생성으로 연장된다. 어쩌면 루쉬를 제3세계의 작가로 간주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박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흑인들이 미국 시리즈물의 인물들이나 노련한 파리지엥들의 역할을 하는 그 순간, 서구로부터 탈주하고, 또한 그 자신으로부터 탈주하여 민족지로서의 영화와 단절하고 <나, 검둥이>라고 말하기 위해 그만큼의 노력을 기울인 사람은 없을 것이다. 발화 행위는 여러 개의 얼굴을 갖고 있고, 아프리카 그 자신과 미국 혹은 파리에 대한 아프리카의 자유간접화법으로서 이제 오게 될 민중의 요소들을 조금씩 심는다. 일반적으로 제3세계의 영화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갖는다. 도취 혹은 위기를 통해, 현실의 부분들이 결여된 민중의 예시로서의 집단적 언표를 생산하도록 하기 위해 이들을 결집할 배치를 구축할 것(그리고 클레가 말했듯이 "우리는 그 이상은 할 수 없다"). p.428-431
간단히 말해 일반적으로 무성영화에서 시각적 이미지는 역사 혹은 사회 속의 인간이 갖는 자연적 존재를 보여주면서 귀화되는 반면, 필연적으로 씌어진, 다시 말하면 읽힌, 그리고 간접화법으로 부과된 '담론' 속에 등장하는 것은 역사뿐만 아니라 자연과도 구별된 또 다른 요소, 또 다른 층위이다. 무성영화는 이후 베르토프나 에이젠슈테인의 방식처럼 자막과 진정한 일체를 이루거나, 또는 시각적인 것에 특별히 중요한 문자적 요소들이 지나가게 하거나(<터부>의 씌어진 명령과 메시지, 혹은 키튼의 <접대의 법칙>에서 딸의 머리 너머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액자에 넣어진 경구를 바라보는 복수심에 불탄 아버지의 예에서 볼 수 있는), 혹은 씌어진 텍스트의 글자를 치밀하게 탐색하는 모든 경우(예를 들어 <전함 포템킨>에서 점점 더 크기가 커져가는 '형제여'라는 단어의 반복처럼)에서 처럼, 보여진 이미지와 읽힌 이미지가 최대한 서로 교착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유성영화의 도래는 무엇을 발생시켰는가? 발화 행위는 더 이상 시선의 이차적 기능을 수행하거나 읽히는 것이 아니라 들려지게 된다. 이제 발화 행위는 직접적이 되어, 무성영화나 쓰여진 텍스트에서 변형된 채로 존재하고 있던 '담론'의 변별적 특성들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다(벤베니스트에 따르면 담론의 변별적 특성이란, 나-너라는 인칭적 관계이다). 그러나 영화가 이러한 이유로 시청각적이게 된 것이 아님은 곧 알게 될 것이다. 시각 이미지와는 또 다른 하나의 이미지였던 막간 자막과는 달리 발성, 음향적인 것은 새로운 시각 이미지의 차원, 새로운 구성요소로서 귀에 들려지게 된다. 음향적인 것이 이미지인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이다. 이것은 연극에서와는 아주 다른 상황이다. 이후 유성적인 것이 시각 이미지를 변형시켰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즉 들려진 것으로서의 유성적인 것은 무성영화에서는 자유롭게 나타날 수 없었던 어떤 것을 그 자체로 보여주게 되는 것이다. 시각 이미지가 탈-귀화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으리라. 실상 시각 이미지는 이미 존재하고 있던 구조와 동시에 그 결과로서의 작용 혹은 반작용과는 엄밀히 구별되는, 인간적 상호작용이라 부를 수 있을 영역을 맡고 있다. 물론 이 상호작용은 구조, 작용 그리고 반작용과 긴밀히 뒤섞인다. 그러나 후자가 발화 행위의 조건 혹은 결과라 할 수 있다면, 전자는 발화 행위의 상관물로서, 나-너 시점의 상호성, 즉 의사소통에 상응하는 상호침투와 같은 것을 이 행위 속에서만, 그리고 이 행위를 통해서만 보여준다. 의사소통의 사회학은 바로 이러한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다. 즉 이미 존재하는 사외적 구조에서 유출되지 않은, 그리고 심리적인 작용, 반작용과 혼동되지 않는, 그러나 발화 행위 혹은 침묵의 행위의 상관물, 즉 사회적인 것에서 자연성을 박탈하고, 균형과는 거리가 먼 체계를 형성하거나 자신이 스스로 균형을 만들어내고(사회화-탈사회화), 주변과 교차로에 자리잡으며, 일상적 삶의 미장센 혹은 극 구조를 구성하고(상호작용의 어려움, 기만 그리고 분쟁), 사회적 지각의 장, 특이한 가시성의 장을 열며, "시선의 이상발달"을 촉진하는, 발화 행위 혹은 침묵의 상관물로서 포착된 상호작용들ㅇ 위에 의사소통의 사회학이 세워진 것이다. 상호작용은 발화 행위 속에서 스스로를 보여준다. 정확히 말해 그것은 상호작용이 개인들을 통해 설명된다거나 하나의 구조로부터 유출된다거나 혹은 단순히 발화 행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관계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보다는 발화 행위 그 자체가 자신의 유통, 전파 그리고 자율적인 진화를 통해 서로에게 무관심한, 산포된, 먼 그룹들 혹은 개인들 사이의 상호적인 작용을 창조하기 때문이다. 마치 이것은 장소와 공간, 그리고 사람들(그 최초의 예들 중 하나는 매물리언의 <오늘 밤 사랑을>일 것이다)을 통과해 지나가는 노래와 같다. 유성영화가 현동한느 상호작용주의적 사회학이라면, 혹은 그 역이라면, 그리고 상호작용주의가 바로 유성영화라고 할 수 있다면, 여기서 루머가 영화적으로 아주 특권적인 대상이었다는 것에 놀랄 이유는 전혀 없을 것이다. p.443-445
만약 슈턴버그의 영화를 위대한 유성영화라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은, 분리된 두 장소, 즉 카바레와 학교가 차례로 침묵과 음향의 시련을 통과한 후 선생 자신의 내면적인 상호작용을 따라, 꼬끼오의 이행이 서로 다른 시간 속에서 학교에서 카바레로, 이어 카바레에서 학교로 이루어지면서 더욱 깊은 상호작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무성영화는 가시적인 이미지와 가독적인 이미지 사이의 분배를 행하였다. 그러나 말이 들리게 될 때, 말은 새로운 무엇인가를 보게 하고, 탈귀화된 가시적 이미지는 이제 가시적 혹은 시각적인 것으로서 읽힐 수 있는 것이 되기 시작한다. 이후 이미지는 자신이 무성영화에서는 갖지 못했던 문제적 가치 혹은 어떤 모호성을 갖게 된다. 발화 행위가 보게 하는 것, 즉 상호작용은 항상 잘못 해석될 수도 있고 잘못 읽히거나 잘못 보여질 수도 있다. 이로부터 시각적 이미지 내에서 분기하는 거짓과 기만이 유래하는 것이다. 장 두셰는 "언어의 영화적 덕성"이라는 말로 맨키비츠를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물론 어떤 작가도 이토록 연극에 아무것도 빚지지 않은 발화 행위를 구사한 사람은 없었다. 맨키비츠의 영화에서 발화 행위는 우선은 많은 참여자들이 지각할 수 없는, 혹은 잘 볼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시각의 이상 증식이라는 능력을 가진 특권적 인물들만이 해독할 수 있는 상호작용을 보게 한다. 결국 말에서 연유한 이러한 상호작용(분기)은 말로 되돌아간다. 너무도 강렬하고 믿기 어려운, 혹은 너무도 끔찍한 것이어서 처음에는 시각에 포착되지 않다가 차후에야 비로소 보여지는 이차적 말 혹은 보이스-오프가 그런 것들이다. 이러한 분기가 맨키비츠의 영화의 이중적인 발화 행위, 즉 한번은 보이스-오프로, 다른 한번은 현동하는 목소리로 행해지는 발화 행위의 시각적 상관물이다.
물론 유성영화는 외관상 가장 피상적이면서 일시적인, 그리고 가장 덜 '자연스럽거나' 가장 덜 구조화되어 있는 사회적 형태들을 그 특권적 대상으로 취해야만 했다. 타인, 다른 성, 다른 계급, 다른 지역, 다른 국가, 다른 문명과의 만남과 같은. 이미 존재하는 사회적 구조가 허약하면 허약할수록, 침묵하는 자연적인 삶이 아닌, 필연적으로 대화를 통해 진행된느 사교성의 순수한 형태들이 더욱 잘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대화란 자신에 외부적이라 할 구조, 위치와 기능, 흥미와 동인,작용과 반작용 등과 분리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또한 대화는 인위적으로 모든 결정인들을 종속시키고 그것으로부터 어떤 목표를 만들거나 혹은 오히려 자신에 상응하는 상호작용의 변수들을 만들어낼 힘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대화를 결정하는 것은 더 이상 흥미도 감정도 아니며 사랑은 더더욱 아니다. 오히려 이것들은 대화에서의 자극의 분배에 의존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대화가 자신에 고유한 힘과 구조화의 관계를 결정한다는 의미에서 그러하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그 자체로 고려된 대화에는 항상 무엇인가 광기와 같은, 그리고 정신분열증적인 것이 존재한다(술집에서의 대화, 사랑 혹은 이해관계의 대화, 또는 이것들의 정수라 할 사교계의 대화). 정신의학자들은 정신분열증 환자들의 대화를 통해, 이 대화가 갖는 매너리즘, 상호작용에서의 근접성, 그리고 거리두기에 대해 연구하고 있지만, 실상 모든 대화란 이미 정신분열적인 것으로서, 대화가 정신분열증의 모델이지 그 역은 아니다. 이 점에서 베르테의 말은 아주 시사적이다. "우연히 말해전 것 전체로서 대활르 검토해봤을 때, 도대체 어떤 수많은 머리를 가진 거의 반 미친 인간이 아니고서야 이를 말했다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이미 결합된 혹은 이미 관계가 맺어진 대화 상대자의 기능을 통해 대화를 고려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일 것이다. 이 경우에조차, 대화의 속성은 목적들을 재분배하고, 되는대로 장면에 나타나는 산포적이고 독립적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정초하는 것이다. 결국 대화는 수축된 루머이며 루머는 팽창된 대화라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둘은 모두 의사소통 혹은 순환의 자율성을 드러낸다. 이제 상호작용의 모델로서 기능하는 것은 대화가 아니라, 오히려 대화의 모델이 되는 것이 분리된 사람들 사이의 혹은 유일한 인물 그 자체 내에서의 상호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사교성이라 부르는 것, 혹은 아주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교취향'이라 부르는 것은 결코 사회 그 자체와 혼동되지 않는다. 즉 여기서는 이미 존재하는 구조에 따라 발화 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는 작용과 반작용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바롸 행위와 일치하는 상호작용이 문제인 것이다. 사회와는 구분된느 대화의 이러한 '사교취향'의 본질은 프루스트가 발견해낸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사회학자 짐멜이 발견해낸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영화와 동시대인이었던 작가들(프루스트, 제임스)이나 혹은 영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까지 한 작가들을 제외하고, 얼마나 연극 혹은 소설이 대화를 그 자체로 포착하는 데 무능했는지를 확인하는 일은 흥미로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실상 가장 저금한 수준의 영화를 제외하고 영화는 결코 연극 혹은 영화화된 소설과 혼동될 수 없다. 영화가 창조해낸 것은 이제까지 연극이나 소설이 포착할 수 없었던 음향적 대화이며, 대화에 상응하는 시각적 혹은 음향적 상호작용이다. 어쩌면 가장 저급한 수준의 영화는 영화화된 대화라는 막다른 골목으로 영화를 이끌고 갈 수도 있었으리라. 결국 대화와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재발견하기 위해서는 네오리얼리즘의 도래, 특히 누벨 바그의 도래가 필요했으리라. 대화와 상호작용은 트뤼포, 고다르, 샤브롤 영화에서 낙관적이면서 패러디적인 혹은 비판적인 양식으로 폭넓게 재활성화된다. 그러나 유성영화 초기부터 대화와 상호작용은 또한 영화가 쟁취해낸 것이었고, 이것은 아주 특별한 장르, 즉 순수하게 영화적인 '코미디', 특히 미국적 코미디를 낳았던 것이다.
대화는 그 내용 혹은 대상과는 독립적으로 개인들 사이의 관계를 밀칙시키거나 벌려놓으면서 상호작용을 이끌어내고, 이 개인들을 승리자 혹은 패배자로 만들며, 그들의 관점을 변경시키거나 혹은 전복시키기까지 한다. 예를 들어 노부인은 기업에 투자할 것인가, 혹은 젊은 여자는 남자를 유혹할 것인가? 경제적인 혹은 사랑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상호작용의 게임에 있어서의 자극이지, 그 역은 아니다. 미국적 코미디가 초기부터 그 역량의 행사를 보여준 바대로, 영화적 발성은 말하는 속도와 보여진 공간을 결합하면서 매순간 '좋은 형식'을 구성하는, 점점 더 그 수가 증식되면서 섬세해지는 조건 속에서, 발화 행위가 공간을 채우는 방식에 의해 정의된다. 모든 사람은 동시에 말한다. 혹은 누군가의 말은 타인의 말을 헛된 시도, 말더듬, 끼어들려는 노력으로 축소시킬 만큼 공간을 완벽하게 점유한다. 미국 가정의 일상적 광기, 그리고 균형과는 동떨어진 시스템 자체의 불균형과도 같은, 지속적인 외부인이나 비정상인의 틈입이 코미디의 고전들을 구성할 것이다. 캐서린 헵번과 같은 여배우는 대사의 속도, 상대방을 물고늘어지거나 당황하게 하는 방식, 내용에 대한 무관심, 그녀가 통과하는 관점의 다양성 혹은 전도 등을 통해 사교성의 내기에서의 그녀의 장악 능력을 보여주었다. 쿠커, 맥캐리, 혹스는 대화, 혹은 대화의 광기를 통해 미국식 코미디의 본질을 만들어냈고, 혹스는 또한 이 코미디에 전대미문의 속도를 부여할 줄 알았다. 루비치는 모든 하위 대화를 점령하였다. 또 캐프라는 정확히 담론 그 자체 내에서 대중과의 상호작용을 보여줌으로써 코미디의 요소로서의 담론에 이르는 데 성공하였다. 이미 <위대한 러글스 씨>에서 맥캐리는 링컨 선언문에 기반을 둔 미국식의 자유로운 화법과 영국적인 신중함과 정확성을 대립시키고 있다. 사교성이라는 형식 자체가, 그 힘의 관계와 그 목표의 본질적인 잔인성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속에서 '인위적 세계', 즉 개인들이 그들 사이의 순수한 상호작용을 생산해내기 위해 상황의 객관적 측면이나 자신들의 활동에서 개인적 측면들을 포기해버린 인위적 세계로 정의되는 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캐프라가 영화적 대상으로서의 담론의 형태를 통해 코미디로부터 '왜 우리는 투쟁하는가'라는 시리즈물로 이행하게 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미국식 코미디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 계급, 그리고 계급 구조에서 이탈된 자들을 동원하여, 이들의 상호작용, 상호작용에 있어서의 난점, 그 속에서의 전복등을 보게 한다. 그래서 객관적인 사회적 내용이 사교성의 형식의 뒷전에 가려 보이지 안ㄴㅎ게 된다 할지라도, 그 주제들은 발화 행위의 주제, 혹은 상호주관적인 집합 속에서 포착된 발화 행위의 변수들로서 국가 혹은 계급의 액센트와 억양 속에 살아남는다. p. 448-452
보여지는 이미지와 읽히는 말 대신, 발화 행위는 들려지게 됨과 동시에 가시적이 되고, 또 시각적 이미지는 발화행위가 구성요소로서 개입되는 시각 이미지 그 자체로서 읽히게 되는 것이다. p.454
간단히 말해 음향은 그 모든 형태로 시각 이미지의 화면 밖 영역에 정착하고, 바로 이런 의미에서 더욱 더 이미지의 구성요소로서 자신을 완성한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목소리의 층위에서, 그 근원이 보이지 않는, 보이스-오프라 부르는 것이다.
우리는 앞선 연구에서 측면과 다른 곳, 상대적인 것과 절대적인 것이라는 화면 밖 영역의 두 측면을 고찰했다. 때로 화면 밖 영역은 권리상 이미지 내의 보여진 공간을 자연적으로 연장하는 시각적 공간으로 환원된다. 이 때 화면 밖의 음은 자신이 유래한 것, 즉 이제 곧 보여질 어떤 것 혹은 다음 이미지에서 보여질 수 있는 어떤 것을 예시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직 보고 있지 않은 트럭의 소리라든지, 현재 한 면의 대화 상대자만을 볼 수 있는 대화의 음향들이 그런 것이다. 이 첫 번째 관계는 주어진 집합과, 이를 연장하거나 포괄하는, 동일한 성질을 갖는 더 큰 집합과의 관계이다. 이와는 반대로 때로 화면 밖 영역은 모든 공간과 집합을 넘어서는 다른 본성을 갖는 어떤 역량을 증언한다. 이 때 화면 밖 영역은 이 집합 전체에 표현된 전체, 운동에 표현된 변화, 공간에 표현된 지속, 이미지에 표현된 살아 있는 개념, 물질에 표현된 정신으로 귀착된다. 이 두 번째 경우, 음향 혹은 보이스-오프는 무엇보다도 음악, 그리고 더 이상 상호작용적이지 않은, 반성적이고 아주 특별한 발화 행위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화면 밖 영역의 두 관계, 즉 다른 집합들과의 현실화될 수 있는 관계와, 전체와 맺는 잠재적 관계는 반비례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 둘은 모두 시각 이미지와 엄격하게 분리되지 않으며, 이것은 이미 무성영화에서도 나타났던 것이다. 영화가 음향적이게 될 때, 그리고 음향이 화면 밖 영역을 채우게 될 때, 이는 비록 새로운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상보성과 반비례라는 두 측면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p.457-458
음향적 연속체 내에서의 위 두 측면의 분화는 분리가 아닌 소통, 그리고 끊임없이 연속체를 재구성하는 순환으로 이루어진다. 미셀 시옹이 분석의 예로 삼고 있는 <마부제 박사의 유언>을 보자. 끔찍한 목소리가 화면 밖 영역의 첫 번째 양상을 따라 항상 옆에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카메라가 이 옆으로 침투해가자마자 우리는 이 목소리가 이미 그 두 번째 양상을 보이면서 아주 전능한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종국에는 보여진 이미지 내에서 그 위치를 확인하고 동일화하게 된다(화면 내 목소리). 그러나 두 양상의 어느 것도 상대방을 폐지하거나 축소하지 않으며 각각은 다른 것 속에 잔존한다. 즉 결정적인 것이란 없다. 이것은 음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안토니오니의 <일식>에서 먼저 공원의 두 연인을 감싸고 있던 음악은, 보이지는 않지만 바로 이들 곁에 있는 피아니스트에게서 오는 것임이 결국 밝혀진다. 화면 밖의 음은 이렇게 다른 지위를 얻게 되고, 한 형태의 화면 밖 영역에서 다른 형태의 화면 밖 영역으로 이행하며, 이어 두 연인이 거리로 나갈 때 그들을 쫓아 여전히 공원 멀리서 들리면서 다시 역방향으로 되돌아간다. p.459-460
이제부터 우리가 다룰 문제는 더 이상 단순하게 시각 이미지에 대한 음향적 요소들의 의사소통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미지에 속한 모든 것들과의 관계 하에서 시각 이미지를 뛰어넘으면서, 시각 이미지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시각 이미지 없이는 결코 가능하지 않을 무엇인가와 이 시각 이미지와의 의사소통이다. 회로는 단지 시각 이미지와 관련한, 음악을 포함한 음향적 요소들의 회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 이미지 그 자체와 도처에서, 화면의 안과 바깥에서 미끄러져가는 음악적 요소, 소음, 음향, 말들의 관계를 말한다.
그러나 무성영화의 시각 이미지가 이미 하나의 전체를 표현했다면, 시각적인 것과 음향적인 것의 전체가 그와 동일한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혹은 이 전체가 동일한 것이라면, 그것은 단지 잉여적으로 반복된 두 개의 표현을 발생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에이젠슈테인에게는 공통된 수치를 발견해낼 수 있는 두 표현형식(여전히 공약 가능성에 기댄)으로 전체를 구성하는 것이 문제였다. 반면 음향적인 것의 성취는 오히려 공약 불가능한, 상응하지 않는 서로 다른 두 방식으로 전체를 표현하고자 한 것이었다.
사실상 이러한 방향 속에서 영화음악의 문제는 에이젠슈테인 식의 헤겔적 방법이 아닌 니체적인 해결방법을 발견하기에 이른다. 니체에 따르면, 혹은 적어도 아직은 쇼펜하우어적인 것에 머물러 있는 [비극의 탄생]에서의 니체에 따르면, 시각 이미지는 아폴론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아폴론은 시각 이미지를 수치에 의거해 운동하게 하고 또 서정시 혹은 드라마의 중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혹은 매개적으로 전체를 재현하게 한다. 그러나 전체는 또한 전자와는 공약 가능하지 않는, 그리고 이제는 음악적이면서 디오니소스적이라 할, 즉 운동이라기보다는 한없는 의지에 더 근접해 있는 직접적인 현시, "즉각적인 이미지"에 의해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비극에서, 음악적인 즉각적 이미지는 아폴론적인 시각 이미지로 둘러싸인, 그리고 이 이미지들의 사열 없이는 가능하지 않는 불의 핵과도 같다. 무엇보다도 시각예술이라 할 영화에서 음악은 전체를 간접적으로 재혔했던 매개적인 이미지에, 즉각적인 이미지를 덧붙인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질에서는 아무 것도 변한 것이 없다. 즉 간접적 재현과 직접적인 현시 사이의 본성의 차이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음악가 피에르 장센이나, 혹은 그보다는 조금 약한 어조의 필립 아르튀스와 같은 음악가에 따르면 영화음악은 시각 이미지 내에서 마치 눈 속에 든 먼지와도 같은 진정한 "낯선 육체" 같은 것, 즉 추상적이고 독립적인 것이어야 하며, "드러내 보여지거나 암시됨조차 없이 영화에 존재하는 어떤 것"을 동반해야만 한다. 물론 어떤 관계라는 것이 존재하지만, 그것은 모방의 관계로 귀착될 외재적 상응이나 내재적인 상응도 아닌, 음악이라는 낯선 육체가 전혀 다른 시각 이미지에 대해 갖는 반응, 혹은 오히려 공통된 구조의 독립적인 상호작용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내재적 상응이 외재적 상응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그것은 곤돌라의 뱃노래가 빛과 물의 움직임 속에서가 아닌, 얼싸안은 베니스의 연인에게서 그 최상의 상관물을 갖는 것과 같다. 이것이 바로 에이젠슈테인을 비판하면서 한스 아이슬러가 말하고 있는 것이다. 시각적인 것과 음향적인 것 사이에 공통된 운동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음악은 운동으로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중복하지 않고도 운동을 자극하는 것"으로서(즉 의지로서) 작용하는 것이다. 운동-이미지, 혹은 운동하는 시각 이미지는 변화하는 전체를 표현하지만 그것은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서이며, 그래서 결국 전체의 속성으로서의 변화란 개개인들 혹은 사물들의 어떤 상대적인 운동과도 정확히 일치되지 않고, 인물 혹은 한 집단의 내적인 감정적 운동과도 일치되지 않는다. 즉 전체는 음악 속에서 직접적으로 스스로를 표현하지만, 시각 이미지의 운동과 대비되거나 혹은 갈등하기까지 하고, 또 부조화되기도 하면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다. 푸도프킨은 이에 대한 교육적이라 할 예를 들고 있다. 프롤레타리아의 시위의 실패는 우울한 음악 혹은 격렬한 음악조차 동반해서는 안되며, 이 실패는 단지 음악, 즉 프롤레타리아의 상승하는 의지로서의 전체의 변화와 상호작용함으로써 드라마를 구성하는 것이다. 아이슬러는 이러한 음악과 이미지의 '비장함의 거리'에 대한 많은 예들을 보여주고 있다. 수동적이거나 의기소침한 이미지를 위한 빠르고 날카로운 음악, 한 장소에서 발생한 격렬한 사건에 대하여 이 장소의 정신을 표현하는 뱃노래의 부드러움 혹은 평온함, 압제의 이미지에 대한 연대성의 찬가... . 간단히 말해 음향의 영화는 변화하는 전체로서의 시간의 간접적 재현에 음악의, 오로지 음악이라는, 비-상응하는 직접적 현시를 덧붙인다. 이것은 시각 이미지를 넘어서지만 그것 없이는 가능하지 않는 살아 있는 개념이다.
니체가 말했듯이 직접적 현시는 자신이 보여주는 것, 즉 변화하는 전체 혹은 시간과 동일하지 않다. 이 현시는 또한 아주 불연속적인, 혹은 희소화되기조차 하는 현전성을 가질 수 있다. 더 나아가, 다른 음향적 요소들이 음악과 유사한 기능을 담당할 수도 있다. 모든 것을 아는 전능한 목소리, 절대적 차원에서의 보이스-오프와 같은(<위대한 앰버슨 가>에서 웰스의 목소리의 변조처럼). 혹은, 이것은 화면 내 목소리에서조차 가능하다. 그레타 가르보의 목소리가 유성영화에서 인정되었다면, 그것은 그녀의 목소리가 어느 순간 각각의 영화 속에서 정감적 움직임으로서의 여주인공의 내적 개성의 변화를 표현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전체 속에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즉 천박한 어조, 달콤한 사랑의 속삭임, 냉혹한 현재의 결심, 기억의 환기, 상상력의 비약 등을 결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그것은 <안나 크리스티>와 같은 그녀의 최초의 유성영화에서부터 이미 볼 수 있었던 것이다). 어쩌면 레네의 <뮈리엘>에서 델핀 세리그는 자신의 목소리 안에 한 전쟁에서 또 다른 전쟁으로, 이전의 불로뉴에서 또 다른 불로뉴로 변화하는 전체를 거두어들임으로써 이와 유사한 효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 같다. 일반적으로 음악은 우리가 시각 이미지에서 그 근원을 보게 되자마자 그 자체로 화면 '내'적인 것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힘을 잃어버리지는 않는다. 이러한 전치는 우리가 이미 차례로 예를 든 두 개념, 즉 파노의 '음향적 연속체'라는 개념과 장센의 '낯선 육체'라는 개념의 표면적인 모순을 지워버린다면 더 잘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두 개념이 공통적으로 상응의 원칙에 대립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사실상 음악, 그리고 침묵을 포함한 모든 음향적 요소들은 시각 이미지에 속하는 연속체를 구성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실은 동일하게 시각 이미지에 속해 있는 화면 밖 영역의 두 측면, 즉 상대적인 화면 밖 영역과 절대적인 화면 밖 영역이라는 두 측면을 따라 이 연속체가 끊임없이 분화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 바로 이 절대를 제시하거나 채움으로써 음악은 낯선 육체처럼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절대 혹은 변화하는 전체는 자신의 직접적 현시와 혼동되지 않는다. 바로 이러한 연유로 이 변화하는 전체는 끊임없이 화면 밖과 안의 음향적 연속체를 재구성하며, 자신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시각 이미지로 이 연속체를 이끌어간다. 그러나 이 두번째 계기는 다른 계기를 폐기하지 못하며, 음악에 자신의 독립적인 특이한 능력을 보존한다. 우리의 논의가 도달한 현 지점에서 여전히 영화는 근본적으로 시각적인 예술로서 남아 있고, 이 시각적 차원과 관련하여 음향적 연속체는 두 방향, 두 이질적인 투사를 통해 분화됨과 동시에 재편성되고 재구성된다. 이 강력한 움직임을 통해, 이미 무성영화에서 시각 이미지들은 변화하는 전체 속에서 내재화되었고, 동시에 변화하는 전체는 시각적 이미지 속에서 외재화되었던 것이다. 음향, 말, 그리고 음악과 함께 운동-이미지의 회로는 또 다른 형상, 또 다른 차원, 혹은 구성요소들을 획득했다. 그렇지만 이 회로는 점점 더 풍요로워지고 복잡해지는 전체와 이미지 사이의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유성영화는 무성영화를 완성한 것이다.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무성이건 유성이건 영화는 끊임없이 스스로 내재화되고 또 외재화되는 거대한 내적 독백을 구성한다. 그것은 언어가 아닌, 언어의 언표 가능한 것(언어학자 귀스타프 기욤이 말하는 언어의 '역량의 기표')이면서 어떤 경우에는 간접적인 언표(막간 자막)로 귀착되고 또 다른 경우에는 직접적 언표 행위(발화 행위와 음악)로 귀착되는 시각적 질료이다. p.462-466
현대영화가 감각-운동적 구조의 붕괴를 함축한다는 것이 사실이라 할 때, 발화 행위는 이제 더 이상 작용과 반작용의 연쇄 내에 자리잡지 않으며, 더욱이 상호작용의 조직을 드러내지 않게 된다. 발화 행위는 자기 자신의 내부로 향하여 더 이상 시각 이미지와의 의존적 관계 혹은 소속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며, 전적으로 독립적인 음향 이미지가 되어 영화적 자율성을 획득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영화는 진정으로 시-청각적인 것이 되기에 이른다. 그리고 이것이 자유간접적인 체제로 이행해가는 발화 행위의 모든 새로운 형식들의 통일성을 이루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발화 행위를 통해 유성영화는 비로소 자율적인 것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작용-반작용, 상호작용, 혹은 반성조차 문제시 되지 않는다. 발화 행위는 변화된 다른 지위를 갖게 된느 것이다. 시네마 '다이렉트'의 예를 통해 우리는 말에 자유간접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이 새로운 지위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바로 이야기 꾸며대기이다. 발화 행위는 루쉬 혹은 페로의 영화에서 이야기 꾸며대기의 행위, 즉 페로가 "생생하게 포착된 전설화하기"라고 부른 것과 민중의 구성이라는 정치적 차원을 포함하게 된다(다이렉트 혹은 체험된 영화로서 소개된 영화가 이렇게 정의될 수 있는 것은 단지 위와 같은 조건을 통해서이다). 발화 행위는 루쉬 혹은 페로의 영화에서 이야기 꾸며대기의 행위, 즉 페로가 "생생하게 포착된 전설화하기"라고 부른 것과 민중의 구성이라는 정치적 차원을 포함하게 된다(다이렉트 혹은 체험된 영화로서 소개된 영화가 이렇게 정의될 수 있는 것은 단지 위와 같은 조건을 통해서이다). 그리고 브레송이나 로메르의 영화와 같은 구성적 영화는 다른 수단을 통해 다른 층위에서 유사한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다. 로메르에 따르면 위기에 처한 사회의 풍속에 대한 분석이야말로 사건에 대한 창조적인, 그리고 사건을 "현실화하는 이야기 꾸며대기 작용"으로서의 말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역으로 브레송의 영화에서 말은 바로 사건을 그 내부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그로부터 우리와 영원히 동시대적인 정신적 측면을 끌어낸다. 이것이 바로 기억, 혹은 전설을 만드는 것 혹은 페기의 '내원적인 것internel'이다. 자유간접적인 발화 행위는 이렇게 이야기 꾸며대기의 정치적 행위, 이야기의 도덕적 행위, 전설의 초-역사적 행위가 된다. 로메르는 로브-그리예처럼 연극과 대립적으로 영화만이 가능할 수 있는 거짓말 행위로부터 단순하게 출발하고는 한다. 그러나 이 두 작가에게서 거짓말이란 특이하게도 그 일상적 개념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것 같다.
감각-운동적 관계의 단절은 단순히 발화 행위에 영향을 미쳐서 그것이 자신으로 회귀하면서 함몰하고, 또 목소리가 자기 자신과 또 다른 목소리들로 환원되도록 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 단절은 또한 시각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쳐서, 이미지가 현대영화에 특징적인 임의의 공간, 텅 비고 탈접속된 공간을 드러내도록 한다. 이것은 마치 말은 이미지로부터 퇴각하여 토대를 정초하는 행위가 되고, 반면 이미지는 그 자신, 공간의 정초화, '지층들', 즉 말 이전 혹은 이후, 인간 이전 혹은 이후의 무언의 역량들을 융기시키고 있는 듯이 보인다. 시각 이미지는 이제 고고학적, 지층적, 구조 지질학적인 것이 된다. 선사로 되돌려지는 것이 아니라(현재의 고고학이라 할 만한 것이 존재한다), 우리 자신의 환영들을 묻고 있는 현재의 황량한 지층, 다양한 방향과 변이 가능한 접속들에 의해 겹쳐져 있는, 공백으로 점재된 지층들로 되돌려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독일의 도시 속의 사막이다. 이것은 또한 선사의 시기를 통해서 추상적인 시적 요소, 우리의 역사와 함께-현전하는 '본질', 우리 역사의 기저에 있는 끝없는 역사를 드러내는 태고의 초석을 만들어내는 파졸리니의 사막이기도 하다. 혹은 이제는 궁극적으로 추상적인 여정만을 간직한, 그리고 태초의 남녀 한 쌍의 증식된 파편들을 가리고 있는 안토니오니의 사막이기도 하다. 이것은 또한 공간의 각 단편들이 자기 자신으로 닫히면서 연결되거나 재-연쇄되는 브레송의 파편화이기도 하다. 로메르의 영화에서 어쩌면 페티시처럼, 그렇지만 또한 꽃병의 조각이나 바다에서나온 무지개빛 사금파리 조각처럼 파편화를 감수하는 것은 여인의 육체일 것이다. 그러므로 '콩트'들은 우리 시대의 고고학적 수집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바다, 혹은 특히 <페르스발>의 공간은 거의 추상화된 여정에 부과된 만곡된 곡선으로 침윤되어 있다. <왕국이 당신을 기다린다>에서 페로는 풍경을 비워버리기 위해 동틀 무렵부터 조립식 가옥들을 쓸어 가는 느린 트랙터들을 보여준다. 과거에 이곳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왔지만, 이제 그들을 비워내려 하는 것이다. <수목 없는 대지의 나라>는 이제는 거의 멸종된 순록의 추상적이라 할 경로 위에 지리학적, 지도 제작적, 고고학적인 이미지들을 겹쳐놓은 걸작이다. 레네는 인물 자신들을 통과하고, 예를 들어 <죽음에 이르는 사랑>에서 식물학자와 사자들의 세계에서 되돌아온 고고학자를 결합시키는, 세계의 시대들과 다양한 지층들의 질서 속에 이미지가 잠겨 들어가게 한다. 그러나 또한 이것은 본질적으로 스트로브의 풍경, 즉 카메라의 움직임이 과거에 발생한 어떤 것에 대해 추상적인 곡선을 그리고, 대지는 그곳에 파묻힌 것으로 인해 가치를 갖는, 텅 비고 틈으로 가들한 지층적 풍경이기도 하다. 레지스탕스들이 자신들의 무기를 감춘 <오통>의 동굴, <포르티니 카니>에서 볼 수 있는, 시민들의 대량 학살이 있었던 대리석 경마장과 이탈리아의 시골, 번제적인 희생자들의 피로 윤택해진 <구름에서 저항으로>의 밀밭(혹은 풀과 아카시아 장면), 그리고 <너무 이른, 너무 늦은>의 프랑스의 시골과 이집트의 시골... . 스트로브적인 쇼트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지층학 개론에서처럼, 사라져버린 외관의 점묘적인 선들,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만질 수 있는 외관의 완전한 선들을 갖는 단층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스트로브에게 시각 이미지란 암석과 같은 것이다.
'텅 빈', '탈접속된'이라는 말은 최상의 단어가 아니다. 인물 없는, 텅 빈 공간(혹은 인물 그 자신이 이 비어 있음을 증언하는 공간)은 아무 것도 결핍되지 않은 충만함을 갖고 있다. 탈접속된, 탈연쇄된 공간의 단편들은 간격을 넘어 특별한 재-연쇄의 대상이 된다. 화음의 부재는 끝없이 형성될 수 있는 연결의 외관일 뿐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고고학적 혹은 지층적 이미지는 보여지는 동시에 읽힌다. 노엘 버치는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연쇄되기를 그치고 거짓 매치나 180도 매치와 같은 체계적 용법을 갖게 될 때, 쇼트들은 그 자신을 뒤집거나 '스스로 반추하게' 되며, 이에 대한 이해는 "기억과 상상력의 대단한 노력을 요구하는 것 같다, 다시 말하면, 독서를 요구하는 것 같다"라고 아주 적절히 말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스트로브의 영화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다네에 다르면, <모세와 아론>은 백색의, 혹은 텅 빈 이미지의 두 측면, 동일한 동전의 안과 겉, "두 측면이 동시에 보여지도록, 결합되고 또 이접되는 어떤 것"이 새겨지게 되는 형상들과 같다. 그리고 그 자체로 애매모호한 풍경 속에 기억된 것, 상상된 것, 인식된 것과 지각된 것의 '유착'이 발생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전에 말했던 것처럼, 지각한다는 것, 그것은, 아는 것, 상상하는 것, 회상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독서란 시선의 기능이며 지각의 지각이고 또 지각의 뒷면, 상상력, 기억 혹은 앎을 포착함이 없이는 지각을 포착할 수 없는 지각이라는 의미에서 그러하다. 간단히 말해 우리가 시각 이미지의 독서라 부르는 것은 이미지의 지층적 상태, 이미지의 선회, 끊임없이 공허에서 충만함, 겉면에서 뒷면으로 전복되는 지각에 상응하는 행위이다. 겉면에서 뒷면으로 전복되는 지각에 상응하는 행위이다. 읽는다는 것, 그것은 연쇄하는 대신 재-연쇄하는 것, 겉면의 한 방향을 따르는 대신 뒤집고 다시 뒤집어 보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지에 대한 새로운 분석학이다. 어쩌면 유성영화의 초기부터 이미 시각 이미지는 그 자체로 가독적인 것이 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유성이 소속관계 혹은 의존성에 의해 이 이미지 속에 존재하는 무엇인가를 보게 하면서 그 자신 또한 보여진 것이었기 때문이다. 에이젠슈테인은 음악적인 것과 관련하여 읽힌 이미지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는데, 이것은 또한 음악이란 시선에 역전 불가능한 방향성을 부과하면서 보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유성영화의 두 번째 단계에서 사정은 이제 동일하지 않다. 그것은 반대로, 들려진 말은 바라보게 하거나 보이기를 그치면서 시각 이미지로부터 독립적이 되고, 반면 시각 이미지 자신은 사물들에 대한 새로운 가독성에 도달함으로서 고고학적 단면 혹은 읽혀야 할 지층적 단면이 된 까닭이다. <구름에서...>는 "바위는 말로 닿을 수 없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장-클로드 보네는 <포르티니 카니>에서 "중심의 거대한 균열", "투쟁이 기록된 장소, 활동 중인 텅 빈 극장처럼 풍경이 읽히게 하는", 텍스트 없는, "풍토적이면서 지질학적인, 그리고 지구물리학적인" 시퀀스를 분석하고 있다. 발화 행위 그 자체가 자율적인 음향적 이미지가 됨과 동시에, 시각 이미지에 대한 새로운 '가독성'의 의미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현대영화가 어떤 의미에서는 유성영화 초기 단계보다 오히려 무성영화에 더 가깝다고 말하고는 한다. 현대영화가 때때로 막간 자막을 재도입해서가 아니라, 시각 이미지 내의 문자체적 요소의 주입과 같은 무성영화의 다른 수단들과 더불어 진행되기 때문이다(공책, 편지 들과, 스트로브 영화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비명, 화석화된 글자들, "기념표지판, 죽은 자들을 위한 기념물, 거리 이름..."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지만 현대영화를 유성영화 초기 단계보다 무성영화에 더 근접시킬 이유란 없다. 무성영화에서 우리는 두 종류의 이미지, 즉 보여진 것과 들려진 것(막간 자막), 혹은 이미지의 두 요소(문자체의 주입)와 대면하고 있었다. 반면 현대영화에서 막간 자막과 문자체의 주입은 지층의 점선들, 혹은 한 지층에서 다른 지층으로의 다양한 접속, 이행에 불과한 것으로서, 시각 이미지는 이제 전적으로 읽혀야 할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바로 여기에서, 예를 들면 고다르 영화에서 볼 수 있는 문자체의 전자기적 변형과 같은 것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현대영화에서 시각 이미지의 가독성, 이미지를 읽어야 할 '의무'는 더 이상 무성영화에서처럼 특정한 하나의 요소로 환원되거나, 유성영화의 초기처럼 보여진 이미지에 대한 발화행위의 전반적인 효과로 귀착되지 않는다. 발화 행위가 다른 곳에서 발생하고 자율성을 획득하게 됨으로써 시각 이미지는 자신을 위한 고고학 혹은 지층학, 다시 말해 시각 이미지 전체, 그리고 오로지 자신하고만 관계하는 하나의 독서를 발견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시각 이미지의 미학은 새로운 성격을 띠게 된다. 시각 이미지의 회화적 혹은 조각적 특질은 마치 세잔느의 바위처럼 지질학적, 구조 지질학적 역량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스트로브의 영화를 통해 최고의 정점에 이른 것이다. 시각 이미지는 자신의 지질학적 토대 혹은 기초를 드러내는 반면, 발화 행위 혹은 음악의 행위는 이제 대기적인 설립자가 된다. 아마도 어쩌면 여기서 오즈의 거대한 역설이 해명될 수 있을 것이다. 오즈는 이미 무성영화 시기에 텅 비고 탈접속된 공간들, 그리고 시각 이미지의 토대를 드러내면서 이 이미지가 그 자체로 지층적인 독서에 순응하게끔 하는 정물들을 만들어내기까지 했던 것이다. 이를 통해 오즈는 유성영화에 대한 어떤 필요도 느끼지 못할 만큼 이미 현대영화를 월등히 앞서갔다. 그리고 아주 뒤늦게 유성영화를 시도할 때, 오즈는 다시 한번 선구적으로, "현시로서의 이미지와 재현적인 목소리 사이의 작업의 구분", 이 둘 각각을 강화시키는 두 역량의 '분리해체' 속에서 유성의 요소를 곧바로 이차적인 단계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현대영화에서 시각 이미지는 전혀 새로운 미학을 획득한다. 이미지는 그 자신 무성영화에서는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역량을 선취하면서 가독적인 것이 되는 반면, 발화 행위는 유성영화의 초기 단계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역량을 선취하면서 이미지와는 다른 곳에서 발생한다. 대기의 발화 행위는 사건을 창조하지만, 항상 구조지질학적인 시각적 지층들 위로 가로질러 놓이게 된다. 이 두 궤도는 서로를 관통해 지나간다. 발화 행위는 사건을 창조하지만, 그것은 사건이 부재한 공간 속에서이다. 현대영화를 정의하는 것은 "말과 이미지 사이의 왕래"로서, 바로 이것이 말과 이미지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낼 것이다(단지 오즈나 스트로브만이 아니라 로메르, 레네 그리고 로브-그리예 등에게서도...). p.468-475
로셀리니의 관심은 새로운 것의 출현으로서의 '투쟁'을 이해시키는 것이다. 즉 서로 다른 두 궤도 사이에서의 투쟁이 아닌, 이 둘을 통해서만, 그리고 이 둘 사이의 왕래에 의해서만 드러날 수 있는 투쟁 말이다. 담론의 형태 아래에서는 매번 옛것과 언어적 투쟁 속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형태의 발화 행위를 발견해야 하고, 사물들의 기저에서는 옛것과 구조 지질학적으로 대립되는 새로운 공간의 형성을 발견해내야 한다. 루이 14세의 공간은 마자랭의 축적과 대립된 정비된 공간이면서, 사물들이 계열적으로 생산되는 제조업적인 공간, 즉 베르사이유이다. 발화 행위는 소크라테스의 것이건 예수의 것이건 성 아우구스티누스 혹은 루이 14세의 것이건, 또는 파스칼이나 데카르트의 것이건, 낡은 형태에서 뽑혀나오고, 이와 동시에 공간은 이전 것을 다시 덮어버리는 새로운 지층을 형성한다. 한 역사적 계기로부터 나와 또 다른 것으로 진입하기 위한 세계의 도정을 드러내는 투쟁, 말과 사물의 이중적인 공구, 즉 발화 행위와 지층화된 공간 아래 새로운 세계의 힘든 분만이 도처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코믹한 것과 극적인 것, 범상한 것과 일상적인 것을 동시에 소환하는 역사에 대한 개념이다. 새로운 유형의 발화 행위와 공간의 새로운 구조화. 거의 미셸 푸코적인 의미에서의 '고고학적' 개념이라 할. 고다르는 바로 이러한 방법을 계승하여 자신만의 교육법, 교수법의 기초로 삼을 것이다. < 6x2>에서의 사물과 말에 대한 수업, 그리고 손님의 강요된 요구에 따라 행해지는 창녀의 자세에 근거한 사물들에 대한 수업과, 이것과 분리된 채로 행해지는, 창녀에게 발음하게 하는 음소에 기반한 말의 수업과 같은, 서로 분리되는 두 수업이 행해지는 <삶, 각자 알아서 구하라>의 유명한 시퀀스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새로운 이미지의 체제가 구축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교육법의 기초 위에서이다. 이미 우리가 보았듯이 이 새로운 체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이미지, 시퀀스들은 앞선 것을 종료하고 뒤이은 것을 개시하는 유리수적 절단에 의해 연쇄되는 것이 아니라, 이 둘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그 자체로 가치를 갖는 무리수적 절단(틈새) 위에 재연쇄된다. 그러므로 무리수적인 절단은 연접적인conjonctive 가치가 아닌 이접적인disjonctive 가치를 갖는다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더욱 복잡한 경우를 고찰할 것인데, 여기서 제기하려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절단이 자율성을 갖는다면, 그것은 어디에서 일어나고 또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우리는 이제 유성영화의 초기 단계와 같이 음향적이고 유성적인 구성요소를 갖는 일련의 최초의 시각 이미지와 대면하게 된다. 이 이미지들은 그러나 자신에 속하지 않은, 또한 이어지는 두 번째 이미지의 연속에도 속하지 않는 어떤 한계를 향해 가고 있다. 그런데 이 한계, 이 무리수적 절단은 아주 다양한 시각적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때로 한계는 두 연속된 이미지들의 정상적인 연쇄를 중단시킬, 일련의 '비정상적인' 혹은 의외적인 이미지들의 연속으로 구성된 정지된 형태를 취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검은 스크린 혹은 백색 스크린의 확장된 형태, 혹은 이것들의 파생물의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 그러나 매번 무리수적 절단은 새로운 유성의 단계, 새로운 음향의 형상을 함축한다. 침묵을 창조하는 것은 유성적인 것과 음악적인 것이라는 의미에서, 이것은 침묵의 행위일 수 있다. 또 이것은 하나의 발화 행위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고전적'인 양상들과 달리 이야기를 꾸며대는, 혹은 기초를 정초한다는 양상을 갖는다. p.476-478
보이스-오프는 유성영화 초기에 자신을 특징지었던 전능한 힘을 잃어버렸다. 보이스-오프는 더 이상 모든 것을 볼 수 없으며, 로브-그리예의 <거짓말하는 사나이>나 마르그리트 뒤라스의 <인디아 송>에서처럼 회의적이고 불확실하고 모호해지는데, 그것은 시각 이미지가 자신에 부족한 전능성을 보이스-오프에 양도함으로써 맺고 있었던 밧줄을 보이스-오프 자신이 끊어버렸기 때문이다. 보이스-오프는 이 전능함을 잃어버렸지만 그 대가로 자율성을 획득한다. 미셸 시옹은 이러한 변모를 심도 깊게 분석하였으며, 보니체르는 이 변모를 통해 '보이스-오프 오프'라는 개념을 제안하기에 이른다.
또 다른 새로움(혹은 첫 번째의 발전)은, 아마도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의미에서든 화면 밖 영역이나 보이스-오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유성과 음향적인 것 전체가 자율성을 획득했다고 할 수 있다. 이것들은 발라슈의 저주(음향적 이미지란 없다...)로부터 해방되어, 초기 단계에서와 같은 시각 이미지의 구성요소이기를 그치고 전적으로 개별적인 이미지가 되었다. 시각 이미지와의 단절로부터, 그리고 이 단절 속에서 음향 이미지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더 이상 로셀리니에게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동일한 시-청각적 이미지의 독립적인 두 구성요소가 아니라, 둘 사이의 균열, 틈새, 무리수적 절단을 갖는, 그 하나는 시각적이고 다른 하나는 음향적인 두 "각기-자율적인" 이미지이다. *역주1) '각기-자율적임heautonomie'은 '스스로'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heauto와 '법'을 의미하는 nomos가 결합된 말로서 '스스로 규제함' 이라는 내포적 의미를 갖고 있다. 칸트는 반성적 판단이 지성/오성이 내리는 규정적 판단과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기 위해 이 개념을 사용한다. 들뢰즈가 주에 명시하고 있듯이 이 개념은 명백히 칸트의 개념에 근원을 두기는 했지만, 본서에서 들뢰즈는 구체적으로 영화적인 맥락 하에서, 즉 영상과 소리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이 둘이 서로 의존하지는 않지만 결국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경우, 혹은 이 둘이 등질성을 이루게 되는 경우를 'autonomie'로, 둘 사이에 간극이 생겨 서로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경우를 'heautonomie'로 표현하고 있다. 본 역서에서는 기존의 칸트 번역서 -전자는 '자율성', 후자는 '자기 자율성'- 와는 달리, 단어의 어원적 의미('스스로의', '각각의')와 들뢰즈이 문맥을 고려하여, 전자(autonomie)를 '자율성'으로, 후자(heautonomie)를 '각기-자율성', '각기-자율적임'으로 번역하였다.* 마르그리트 뒤라스는 <갠지스의 여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것은 두 영화, 이미지로 이루어진 영화와 목소리로 이루어진 영화이다. (...) 두 영화가 전적인 자율성 속에서 존재한다. (...) (목소리는) 더 이상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보이스-오프가 아니다. 목소리는 영화의 진행을 용이하게 하기는 커녕 구속하고 혼란스럽게 한다. 보이스-오프를 이미지의 영화에 다시 연결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이렇게 다른 한편으로, 그리고 동시에, 발라슈의 두 번째 저주 또한 사라진다.발라슈는 음향적 클로즈업과 디졸브의 존재를 인정했지만, 음향이란 양옆의 측면들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발라슈에 따르면) 음향적 프레임화의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였다. 그러나 시각적 프레임화는 이제 가시적인 대상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한 측면에 대한 선택에 의해 정의되기보다는 각 측면들의 연결을 탈접속시키는, 혹은 대상들에 주어진 공간에서 순수한 공간, 임의적 공간을 추출하여 각 측면들 사이에 공허를 설정하는 관점의 창조에 의해 정의된다. 반면에 음향적 프레임화는 소음, 음향, 말, 그리고 음악 속에 주어진 청각적 연속체로부터 추출되어야 할 순수한 발화 행위, 음악 혹은 침묵의 행위 그 자체의 창조에 의해 정의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화면 밖 영역은 존재하지 않으며 채워야 할 화면 밖의 음향 역시 존재하지 않는데, 그것은 화면 밖 영역의 두 형태,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음향적 분배란 아직 시각 이미지에 속해 있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시각 이미지는 자신의 외재성을 포기하고 세계로부터 단절되어 자신의 이면을 획득함으로써, 그가 의존하고 있던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와 평행하게, 음향적 이미지는 스스로의 의존성을 흔들어 깨워 자율적인 것이 됨으로써 자신의 프레임을 획득하게 된다. 유일하게 프레임화된 시각 이미지의 외재성(화면 밖 영역)은 두 프레임화, 즉 시각적인 것과 음향적인 것 사이의 틈새, 시각적인 것과 음향적인 것, 이 두 이미지 사이의 무리수적 절단에 의해 대체되는 것이다. p.480-483
이제 우리는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 첫 번째 문제는 만약 음향의 프레임화가 영화의 창조적인 조건 속에서 순수한 발화 행위 혹은 음악의 행위를 추출하는 데 있다면, 이 행위는 무엇으로 이루어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순수하게 영화적인 언표 혹은 언표 행위'라 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문제는 명백히 영화를 넘어선다. 이미 사회 언어학은 발화 행위와 그 분류 가능성에 아주 많은 관심을 가져왔었다. 유성영화는 자신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전혀 의도하지 않고, 다른 영역에도 그 파장이 미칠 수 있는, 그리고 철학적인 중요성을 가질 분류화를 제안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영화는 무엇보다도 상대적인 화면 내 음향과 화면 밖 음향 속에서 상호작용의 발화 행위들을 구분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절대적인 화면 밖 음향에서 반성적인 발화 행위들을 구분할 것을 제안하였고, 마지막으로 자율적인 것이 되면서 더 이상 시각 이미지에 속하지 않게 된 만큼 순수해졌다고 할, 더 신비로운 발화 행위들, 이야기를 꾸며대는 행위들, "생생하게 포착된 전설화하기"를 구분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므로 첫 번째 문제는 순수하게 영화적인 이러한 행위들의 성격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문제는 다음과 같다. 발화 행위란 순수한 것이다라고 전제될 때, 즉 더 이상 시각 이미지의 구성요소나 차원이 아닐 때, 시각적인 것과 음향적인 것은 진정으로 시청각적인, 하나의 동일한 이미지의 자율적인 두 구성요소가 됨으로써(예를 들어 로셀리니에서처럼) 이제 이미지의 위상은 변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 운동을 멈출 수 없다. 시각적인 것과 음향적인 것은 그 둘 사이의 무리수적 절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분리되고, 해체되거나, 이탈된 청각적 이미지와 시지각적 이미지라는 두 각기-자율적인 이미지를 발생시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시-청각적이게 된 이미지는 폭발하는 대신, 그와는 반대로 더 복잡한 시각 이미지와 음향 이미지의 관계에 의존하는 새로운 견고성을 획득하게 된다. 결국 우리는 두 이미지는 모두 동일한 필름 위에 씌어지고 동시에 보여진다는 '물질적 공존성'에 의해서만 연결되어 있다는, <갠지스의 여인>에 대한 마르그리트 뒤라스의 선언을 믿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게다가 이 선언은 자신이 부인하는 것을 오히려 선포하고 있는 유머러스한 혹은 선동적인 선언이라 할 것인데, 그것은 실상 두 이미지 각각에 상대편이 갖고 있는 능력을 빌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예술에 고유한 어떤 필연성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미학적인 체하는 많은 나쁜 영화들에서처럼, 혹은 미트리가 뒤라스를 비난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우연성과 무동기성, 그저 막가는 것 이외의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두 이미지의 각기-자율성heautonomie은 이미지의 시-청각적 본성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고, 시-청각적인 것의 쟁취를 공고히 한다. 그러므로 두 번째 문제는 이질적인, 비-상응하는, 부조화 상태에 있는 두 이미지의 복합적인 관계, 이 새로운 교착, 특이한 재-연쇄에 관계된다 할 것이다.
순수한 발화 행위, 영화적으로 고유한 언표 혹은 음향 이미지를 추출해낼 것, 이것이 바로 장-마리 스트로브와 다니엘 위이예의 작품이 갖는 첫 번째 양상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 행위는 자신의 가독적 기초, 즉 텍스트, 책, 편지 혹은 자료에서 뿌리째 뽑혀야 한다. 이 뿌리째 뽑는 행위는 감정의 격발이나 정열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텍스트에 대한 어떤 저항을 전제하며, 그러니 만큼 더욱 더 텍스트에 대한 존중을 전제하는 것으로서, 그러나 또한 매번 텍스트로부터 발화 행위를 끄집어내기 위한 아주 특별한 노력을 전제하는 것이다. <안나 막달레나 바흐의 연대기>에서 안나 막달레나로 가정된 목소리는 바흐 자신의 편지와 아들의 증언들을 말함으로써, 결국 그녀는 이를 통해 일종의 자유간접담론에 도달하여, 마치 바흐가 쓰고 말하듯 말한다. <포르티니 카니>에서는 먼저 책이 보여지고 페이지들이 보여진 후, 페이지를 넘기는 손과, 이어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단락들을 읽는, 그러나 10년의 세월이 경과한 후, 피로가 휩쓸고 지나간, '자신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으로 축소된 포르티니가 보여지면서, 놀람과 경악 혹은 수긍, 알아보지 못함 혹은 이미 들었던 것 같은 착각 등을 거쳐가는 목소리를 듣게 된다. 그리고 물론 <오통>은 텍스트를 보여주지도, 연극의 상영을 보여주지도 않지만, 대부분의 배우들이 언어를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이탈리아어 식, 영어 식, 혹은 아르헨티나어 식의 액센트) 더더욱 이것들을 함축하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이 연극 상연에서 뿌리째 뽑아올린 것은 리듬 혹은 템포이고, 이들이 또한 언어로부터 뿌리째 뽑아올린 것은 '실어증'이다. <구름에서 저항으로>에서 발화 행위는 신화로부터 추출된다('아니, 나는 원하지 않아...'). 그리고 아마도 2부, 즉 현대의 부분에서야 겨우 발화 행위는 텍스트 혹은 신들이 이미 설정한 언어의 저항을 꺾게 되기에 이르는 것 같다. 여기에는 항상 순수한 발화 행위를 이끌어낼, 혹은 뒤라스의 말처럼 순수한 발화 행위를 '프레임화'할 낯설음이라는 조건들이 존재한다. 모세 자신은 고대의 신들의 저항을 꺾고 자신의 재단에조차 고정되기를 원치 않은 보이지 않는 신 혹은 순수한 말씀의 사자이다. 그리고 어쩌면 스트로브와 카프카의 만남을 설명하는 것은 카프카 또한 지배적인 텍스트, 기존의 법칙, 이미 결정된 선고들의 저항을 분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단지 발화 행위일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 <아메리카, 계급관계>에서 보여지는 것이 이러한 것이라면, 발화 행위는 그에 저항하는 것으로부터 뿌리째 뽑혀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더 이상 충분치 않다. 발화 행위는 그 자신, 저항한다. 곧 발화 행위는 저항의 행위이다. 발화 행위는 자신을 위협하는 것에 대항하여 저항적이 되지 않고서는 그에게 저항하는 것으로부터 뽑혀나올 수 없다. '폭력이 지배하는 곳에서' 원조의 힘을 주는 것은 폭력 그 자신이다. 이것이 바로 바흐의 히나우스Hinaus!(저리 가!)이다. 발화 행위는 이미 이를 통해 모세의 '송가 연설'에서 뿐만 아니라 악보로부터 뽑혀나오는 바흐 음악의 연주에서, 편지와 자료로부터 뽑혀 나오는 안나 막달레나의 목소리 그 이상으로 음악의 행위가 되고 있지 않은가? 발화 행위 혹은 음악의 행위는 투쟁이다. 자신에 저항하는 것에 자신을 부과하기 위해서 발화 행위는 아주 검소하고 드문 것이 되어야 되고, 한없이 참아야 하며, 그러나 또한 그 자신 저항, 저항의 행위가 되기 위하여 극도로 폭력적인 것이어야 한다. 저항할 수 없이, 발화 행위는 솟아오른다. <화해하지 않은 사람들>에서 발화 행위는 이제 실어증적이라기보다는 분열증적인. 그리고 마지막 권총 일격의 음향적 이미지에 이르기까지 상승해 가는 노파의 발화 행위이다. "나는 어떻게 시간이 늘어서는지 바라보았다. 그것은 끓어오르고, 파닥거리고, 사탕 하나에 백만 프랑을 지불하더니, 작은 빵 하나에 지불할 3수우도 갖고 있지 않더라." 발화 행위는 자신이 통과하는, 그리고 균열과 공백으로 이루어진(힌덴부르크, 히틀러, 아데나워, 1910, 1914, 1942, 1945...) 다양한 대열을 갖는, 그만큼의 지질학적인 단면, 고고학적 지층으로 조직된 모든 시각 이미지들 위에 비스듬히 놓여 있는 것 같다. 바로 이것이 스트로브 영화에서의 음향 이미지와 시각 이미지의 비교적인 지위이다. 사람들은 텅 빈 공간에서 말하고, 말이 솟아 오르는 동안, 공간은 대지로 함몰하여, 무엇인가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고학적 매몰, 지층적 두께를 읽게 하면서, 필연적이었던 노동들과 들판을 살찌우기 위해서인 듯이 제물로 바쳐진 희생자들, 일어났던 투쟁들과 버려진 시체들을 증언한다(<구름에서 저항으로> <포르티니 카니>). 역사는 대지와 분리될 수 없고, 계급투쟁은 땅 밑에 있으며, 그래서 만약 우리가 사건을 포착하기를 원한다면 이를 보여주거나 죽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로 함몰해서 그 내면적 역사(단지 다소간 먼 과거가 아닌)를 이루는 모든 지질학적 지층들을 따라가야 한다. 나는 소리만 요란한 거대한 사건들을 믿지 않는다 라고 니체는 말한다. 사건을 포착하는 것은 그것의 진정한 연속성을 구성하는, 혹은 이 사건을 계급투쟁 속에 새기는 대지의 말없는 지층에 이 사건을 다시 연결시키는 것이다. 역사에는 농부와 같은 어떤 것이 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자신, 발화 행위에 저항하고 또 이 발화 행위에 침묵하고 있는 퇴적들을 대립시키는 것은 바로 시각 이미지, 지층적 풍경이다. 편지, 책, 그리고 자료들조차 발화 행위가 잡아 뽑혀야 하는 것으로서, 기념물, 해골더미, 비명들과 함께 풍경 속으로 들어간다. '저항'이라는 말은 스트로브의 영화에서 아주 많은 의미를 갖는데, 이제 발화 행위, 모세에 저항하는 것은 바로 대지, 나무, 그리고 바위이다. 모세는 발화 행위 혹은 음향 이미지인 반면 아론은 시각 이미지로서, 그는 '보게 하'며, 그가 보게 하는 것은 바로 대지로부터 오는 연속성이다. 모세는 새로운 유목민, 끝없이 유랑하는 신의 말씀 이외의 어떤 대지도 원하지 않는 유목민인 반면, 아론은 영토를 원하고, 운동의 귀착지로서 이미 그 영토를 '읽는다'. 이 둘 사이에 있는 것은 '아직은 부재한', 그러나 이미 거기 있는 사막, 그리고 물론 민중이다. 아론은 모세에 저항하고, 민중은 모세에 저항한다. 민중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시각 이미지 혹은 음향 이미지, 발화 행위 혹은 대지? 모세는 아론을 대지 속에 파묻지만 아론 없는 모세는 민중과, 대지와 관계를 맺을 수 없다. 우리는 모세와 아론이 관념의 두 측면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들은 이제 결코 하나의 전체가 아닌, 말이 전체적인 것이 되는 것을 방해하고 또한 대지가 최후의 지층에 속하거나 소유되거나 순응하게 되는 것을 방해하는 저항적인 이접관계를 형성할 것이다. 이것은 마치 스트로브의 스승이기도 한 세잔느의 경우와도 같다. 한편에, 땅 밑으로 가라앉아 '지질학적 지반들'을 읽게 하는 시각 이미지의 '고집스런 기하학'(데생), 그리고 다른 한편에, 구름, '대기의 논리'(세잔느가 말하는 색과 밫), 그리고 물론 대지로부터 태양을 향해 융기하는 발화 행위. 그러므로 두 궤도가 있다. '목소리는 이미지의 다른 편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서로는 서로에 저항하지만, 바로 이렇게 끊임없이 재창조되는 이접을 통해 대지 아래의 역사는 감동적인 미학적 가치를 갖게 되고, 태양을 향해 상승하는 발화 행위는 강렬한 정치적 가치를 갖게 된다. 유목민의 발화 행위(모세), 사생아의 발화 행위(<구름...>), 망명자의 발화 행위(<아메리카...>)는 정치적 행위이고, 바로 이를 ㅗㅇ해 그것들은 초기부터 저항의 행위가 된다. 스트로브가 카프카로부터 이끌어낸 영화에 <아메리카, 계급관계>라는 제목을 부여한 이유는, 그 서두부터 주인공이 지하의 남자, 아래층의 운전수를 지지하고, 그를 자신의 삼촌과 분리시키는 상류 계급의 흉계(편지의 전달)와 대면해야 하는 까닭이다. 발화 행위, 즉 음향 이미지는 세속과 신성의 분배를 흐트러뜨렸던 바흐에게서 만큼이나, 그리고 사제와 민중의 분배를 변모시킨 모세에게서 만큼이나 저항의 행위이다. 그러나 역으로 시각 이미지, 즉 대지의 풍경은 자신 위에 세워진 역사의 지층들과 정치적 투쟁을 발굴하는 모든 미학적 역량을 펼친다.<모든 혁명은 주사위 던지기와 같다>에서, 사람들은 파리 코뮌의 시체들이 묻힌 묘지 언덕에서 말라르메의 시를 낭송한다. 이들은 마치 무덤에서 파낸 물건들처럼 서체의 특성에 의거해 시의 구성요소들을 서로 나누어 갖는다. 말리 사건을 창조하고 이를 융기하게 해야 함과 동시에, 침묵하고 있는 사건이 대지에 다시 덮이게 해야 한다. 사건, 그것은 항상 발화 행위가 뽑아낸 것과 대지가 묻어버리는 것 사이의 저항이다. 그것은 하늘과 대지의 순환, 외부의 빛과 지하의 불의 순환, 그리고 또 음향적인 것과 시각적인 것의 순환으로서, 이것은 결코 하나의 전체를 재형성함이 없이, 매번 두 이미지의 이접인 동시에 관계의 부재가 아닌 관계의 새로운 유형, 지극히 적확한 공약 불가능성의 관계를 구성하는 것이다. p.483-489
연극으로부터 분리되고 글쓰기로부터 뽑혀나온 순수한 그러나 또한 다의적인 발화 행위를 음향 이미지에서 추출해내듯, 시각 이미지에서 우리는 재 속에 묻힌 삶 혹은 거울 뒤편의 삶을 발견해낸다. '비시간적인' 목소리들은 시각적 본질과 대치하고 있는 음향적 본질의 네 측면과도 같다. 시각적인 것과 음향적인 것은 동일하지만 차이나는, 한없는 어떤 사랑의 이야기로 열린 관점들이다. <인디아 송> 이전에 이미 <갠지스의 여인>은 음향 이미지의 각기-자율성heautonomie을 두 개의 비시간적 목소리라는 토대 위에 세우면서, 시각적인 것과 음향적인 것이 그들 상호간의 측면들을 상실하고 그들 자신이 그 관점이라 할 무한의 지점과 '만나게' 될 때 이를 영화의 끝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이후 <텅 빈 캘커타의 베니스의 이름>은 결혼 후 얻은 여인의 이름 기저에 있는 소녀적 이름과 같은 훨씬 더 오랜 지층을 이끌어내면서, 시각 이미지가 두 이미지에 공통된 무한의 지점에 이르는 순간(마치 시각적인 것과 음향적인 것이 촉각적인 것, '접합점'과 더불어 종료되기라도 하듯이), 여전히 어떤 끝을 향해 가는, 폐허로 돌려진 시각 이미지의 각기-자율성을 완강히 주장한다. <트럭>은 가시적인 것이 스스로 해체되거나 비워지는 한에서, 역행적으로 목소리에 하나의 육체를 줄 수 있게 된다(운전실, 여정, 유령과 같은 트럭의 출현). "이야기의 장소들만이 존재한다, 그리고 일어나지 않은 이야기란 없다."
마르그리트 뒤라스의 초기 영화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집 혹은 공원-집으로 이루어진 주택단지의 모든 역량들, 공포와 욕망, 말하기와 침묵하기, 나가고 들어오기, 사건을 만들고 묻어버리기 등이다. 마르그리트 뒤라스는 집이라는 주제에 대한 위대한 시네아스트이다. 이 집이라는 주제는 영화에서 참으로 중요한 주제인데, 그것은 단지 그 모든 의미에서 여인들이 집에 '거주'한다는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정열이 여인들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파괴한다는 것, 그녀가 말했다>와, 특히 <나탈리 그랑제>, 그리고 이후의 <베라 박스테르>가 보여준 것이다. 그런데 왜 뒤라스는 <나탈리 그랑제>를 그 뒤로 이어지는 삼부작의 준비작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베라 박스테르>에서 자신의 작품의 퇴행을 보는 것일까? 물론 한 예술가 스스로가 충분히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 작품에 대해, 더욱 더 심층적인 목표에 비춰볼 때 그것은 앞으로건 혹은 뒤로건 하나의 걸음에 불과한 것일 뿐이라고 평가하는 일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마르그리트 뒤라스의 경우에 집은 이제 동일한 시-청각적 이미지에 대하여 단지 시각적, 음향적인 구성요소들의 자율성만을 보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녀를 더 이상 만족시키지 못한다(집은 여전히 말과 공간이라는 이중적 의미에서 하나의 장소, 로쿠스locus이다). 그러나 더 멀리 갈 것, 시각 이미지와 음향 이미지의 각기-자율성에 도달할 것, 이 두 이미지를 통해 무한에 위치한 공통의 지점에 대한 관점들을 만들어낼 것, 즉 이 새로운 무리수적 절단의 개념화는 집 속에서, 그리고 집과 함께는 더더구나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다. 아마도 공원-집은 이미 임의의 공간이 갖는 대부분의 속성들, 비어 있음과 탈접속들을 갖고 있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임의의 공간이 오직 탈주 속에서만 구축되기 위해서는 발화 행위가 '빠져나가고 탈주'해야 함과 동시에, 집을 떠나고 소멸시켜야 했다. 단지 이러한 탈주 속에서 인물들은 서로 조우하고 화답해야 했던 것이다. 어느 누구에게도 귀속될 수 없는 발화 행위의 각기-자율성과 필적할 수 있는 또 다른 각기-자율성에 공간이 다다르기 위해서는 거주할 수 없음을 표현하고, 공간을 거주할 수 없이 만들어야만 했던 것이다(공원-집 대신에 바다-해변). 더 이상 이야기를 갖지 않는 장소(시각 이미지)를 위한, 더 이상 장소를 갖지 않는 이야기(음향 이미지). 이 때 시-청각적인 관계를 구성하는 것은 이 새로운 무리수적 절단의 선, 그리고 이를 사유하는 새로운 방식일 것이다.
순수한 발화 행위가 된 음향 이미지와, 가독적 혹은 지층적이 된 시각 이미지의 이접과 관련하여 마르그리트 뒤라스의 작품과 스트로브의 작품을 구별하는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 차이점은, 뒤라스의 영화에서 도달해야 할 발화 행위란 온전한 사랑 혹은 절대적인 욕망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침묵일 수도, 혹은 노래, 혹은 <인디아 송>의 부영사의 외침과 같은 외침일 수도 있다. 이것이 기억과 망각, 고통과 희망을 지배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은 글쓰기보다 더 심원한 한없는 글쓰기, 독서보다도 더 깊은 끝없는 독서를 구성하는, 자신이 뽑혀나온 텍스트 전체와 공통된 외연을 갖는 창조적인 이야기 꾸며대기 행위fabulation이다. 두 번째 차이점은 마르그리트 뒤라스의 시각 이미지에서 점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액체성에 있다. 이것은 곧 강으로부터 올라오는, 또한 모래사장과 바다에 펼쳐지는 인도의 열대성 습기이다. 이것은 또한 이미 보스에서 바다까지 <트럭>을 유인했던 노르망디의 습기이기도 하다. 그래서 아가타의 폐쇄된 방은 집이라기보다는 발화 행위가 펼쳐지는 동안 해변으로 나아가는 느린 유령선과도 같다(바로 여기에서 자연스런 연속으로서의 <대서양의 사나이>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마르그리트 뒤라스가 이렇게 해양 풍경을 창조해냈다는 것은 커다란 중요성을 갖는다. 그것은 단지 뒤라스가 프랑스 유파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즉 회색 빛깔, 특별한 빛의 운동, 태양과 달의 교차, 물 속에 잠드는 태양, 액체적인 지각 등을 다시 계승했다는 의미에서만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스트로브와는 달리, 시각 이미지가 지층적 혹은 '고고학적' 가치를 넘어 지층들을 섞고 조각품들을 쓸어가는, 영원성의 가치를 갖는 강과 바다의 고요한 역량을 향해가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우리는 지상으로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바다로 돌아간다. 사물들은 건조한 대지 속에 파묻히기보다는 물결에 실려 사라져간다. <오렐리아 스타이네르>의 서두는 <구름에서...>의 시작과 비교될 만하다. 여기서 문제는 발화 행위를 신화로부터, 이야기를 꾸며대는 행위acte de fabulation를 이야기로부터 뽑아내는 것이다. 그러나 조각품들의 이미지는 자동차 앞쪽으로의 트래블링에, 이어 강의 거룻배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결의 고정된 쇼트에 자리를 내준다. 간단히 말해, 시각 이미지에 고유한 가독성은 대지적, 지층적이라기보다는 이제 대양과 같은 것이 되는 것이다. <아가타와 끝없는 독서>는 독서행위를 사물들의 지각보다 더 심원한 바다의 지각으로 돌려주고, 동시에 글쓰기를 텍스트보다 더 심원한 발화 행위로 환원한다. 영화적으로 말해, 마르그리트 뒤라스는 다음과 같이 말할 위대한 화가에 근접해 있다 할 것이다. 내가 만약 하나의 물결, 오직 하나의 물결을 포착하기에 이를 수 있다면... . 혹은 물에 젖은 약간의 모래만이라도... . 여기에 또 다시 세 번째의 차이점, 물론 이미 앞선 두 가지와 연관된 차이점이 있을 것이다. 스트로브에게 계급투쟁은 공약 불가능한 두 이미지 즉, 시각적인 것과 음향적인 것, '자신의 계급의 배반자'라 칭할 수 있을 누군가의 중계 없이는 신들 혹은 지배자의 담론으로부터 발화 행위를 뽑아낼 수 없는(이것이 바로 포르티니의 경우이다. 그러나 우리는 바흐, 말라르메, 카프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음향 이미지와 대지가 노동자들, 그리고 특히 농부들의 투쟁, 모든 위대한 저항으로 살찌워지지 않고는 자신의 지층적 가치를 얻을 수 없는 시각 이미지 사이에서 끊임없이 순환하는 관계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스트로브는 자신의 작품이야말로 철저하게 마르크시즘적인 것이라고 소개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사생아 혹은 망명자까지를 고려해서 말이다(<아메리카...>를 추동시킨 아주 순수한 계급관계를 포함해서). 마르크시즘과는 거리를 둔 채, 마르그리트 뒤라스는 단지 자신의 계급에 배반자일 인물들에 만족하지 않고, 계급 바깥에 위치한 사람들, 걸인 여인과 문둥병자들, 부영사와 아이, 세일즈맨들과 고양이들을 소환하여 이들을 '폭력의 계급'으로 만든다. <나탈리 그랑제> 이후로 나타나는 이 폭력의 계급은 난폭한 이미지를 통해 보여지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계급이 이번에는 두 종류의 이미지 사이를 순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은향 이미지 내의 욕망-발화의 절대적 행위, 시각 이미지 내의 대양-강의 끝없는 역량이 서로 소통되게 한다. 강과 노래가 만나는 곳에서의, 갠지스 강의 걸인 여인처럼.
그러므로 그 두 번째 발전 단계에서 발성, 음향은 더 이상 시각 이미지의 구성요소이기를 그친다. 시각적인 것과 음향적인 것은 시-청각적 이미지의 두 자율적인 구성용소, 혹은 더 나아가 두 각기-자율적인 이미지가 된다. 이것은 바로 다음과 같이 블랑쇼처럼 말하는 것일 것이다. "말한다는 것, 그것은 보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한다는 것은 보는 것, 보게 하는 것 그리고 보여지기조차 그치는 것처럼 보인다. 단지 이에 대한 우선적인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말한다는 것은 그 고유한 일상적이거나 경험적인 실행을 단념하고,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동시에 오로지 말해질 수밖에 없는 어떤 한계를 향해 선회하게 된다면 그때서야 비로소 시각적인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상이한 말, 여기저기로 미치는, 그리고 그 자신, 말한다는 것과는 다른..."). 만약 이 한계가 순수한 발화행위라 한다면, 발화 행위는 또한 외침의 양상, 음악적이건 혹은 음악적이지 않건 음향의 양상을 취할 수 잇을 것이며, 이 때 계열 전체는 독립적인 요소들로 구성되어 그 각각이 이제 그들 자신, 여기 저기에서 데쿠파주, 전치, 역행, 예상의 가능성들과 관계를 갖는 어떤 한계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음향적 연속체는 더 이상 시각 이미지와의 소속 관계 혹은 화면 밖 영역의 차원에 의거해 분화되지 ㅇ낳고, 음악 또한 어떤 가정된 전체의 직접적 현시를 더 이상 보증하지 않는다. 이 연속체는 이제 로브-그리예의 영화에서 (특히 <거짓말하는 사나이>에서) 모리스 파노가 주장했던 혁신이라는 가치를 갖게 된다. 이 연속체는 음향 이미지의 각기-자율성을 보증하며, 이는 또한 당연히 엄격한 의미에서의 말과는 일치하지 않는 한계로서의 발화 행위와, 당연히 음악적인 요소로 이루어지지 않은 계열의 음악적 조직에 동시에 다다라야 한다. 그러나 이로부터 현대영화에서 음향의 우위를 결론짓는다면 그것은 틀린 일일 것이다. 실상 동일한 주의가 시각 이미지에도 유효하다. 본다는 것은, 그 자신의 경험적 실행에서 잡아 뽑혀져, 보이지 않는 어떤 것, 그러나 동시에 보여질 수밖에 없는 어떤 것의 한계로 향해 가는 한에서만 각기-자율성을 획득할 것이다(본다는 것과는 다른, 임의의, 텅 비고 탈접속된 공간들을 통해 가는 일종의 투시와도 같은). 말이 실어증 환자의, 혹은 기억상실자의 언표이듯, 이것은 티레지아스의, 눈먼 자의 비전인 것이다. 이제 두 능력 중 어느 것도, 이 둘을 분리하는, 그러나 동시에 분리하면서 서로에게로 이끌어가는 어떤 한계에 도달하지 않고서는 더 상위의 실행으로 고양되지 못할 것이다. 말이 발언하는 것, 그것은 또한 시선이 투시를 통해서만 바라보는 보이지 않는 것이며, 시선이 보는 것, 그것은 말이 말해질 수 없는 것으로서 발언하는 어떤 것이다. 마르그리트 뒤라스는 '투시적인 목소리'라는 말을 쓸 것이고, 이 목소리로 하여금 빈번하게 '나는 본다', '나는 보지 않고 바라본다, 그래 바로 그것이다' 라고 말하게 할 것이다. 보이는 어떤 것처럼 말을 찍는다는 필리퐁의 공식은, 본다는 것과 말한다는 것이 이렇게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만큼 더욱 더 유효한 것으로 남을 것이다. 시각 이미지와 음향 이미지가 각기-자율적이게 될 때, 이미지들은 그러므로 새로운 상응이 이들의 비-상응성에 의해 결정된 형식으로부터 태도하는 만큼 더욱 더 순수한 시-청각적 이미지를 구성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각 이미지를 서로 다른 것과 다시 관계 맺는 각자의 한계이다. 이것은 자의적인 구성이 아니라, <갠지스의 여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두 이미지가 서로 접하면서 사멸하게 되는, 그러나 이 둘은 이들이 분리되어 있도록 하는 한계에서만, 즉 '이러한 이유로 뛰어넘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또한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뛰어넘어지는' 한계에서만 서로 접하게 하는, 아주 엄격한 구성을 이룬다. 시각 이미지와 음향 이미지는 특별한 관계, 자유간접적 관계로 들어간다. 이제 우리는 사실상 시간의 간접적 재현을 이루면서 음악으로부터 직접적 현시를 얻을 수 있었던, 즉 전체가 이미지를 내재화하고 이미지 속에서 외재화되는 고전적 체제와 더 이상 관계하지 않는다. 이제 직접적이 된 것은 비대칭적인, 총체화할 수 없는, 그리고 서로 접하면서 사멸하는 두 개의 국면을 갖는 시간-이미지 그 자체이며, 이것은 모든 외부보다 더 먼 바깥과, 모든 내부보다 더 깊은 안의 이미지, 여기에서는 음악적 언표가 솟아올라 뽑히고, 저기에서는 시각적인 것이 다시 덮이거나 혹은 매몰되는 시간-이미지이다. p.491-496
영화는 보편적인 랑그도, 원시적인 랑그도 아닐 뿐만 아니라 언어라고조차 말할 수 없다. 언어가 전제, 조건, 필연적 상관물들을 통해 자신의 고유한 '대상'(단위와 기표적 조작)을 구축하는 것처럼 영화는 이러한 전제, 조건, 필연적 상관물들과 같은 어떤 인지적 질료를 드러낸다. 그러나 분리시킬 수조차 없는 이 상관물들은 특이한 것이다. 그것은 운동과 사유의 사행(전언어적 이미지), 그리고 이 운동과 사행에 대한 관점들(전기표적 기호)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은 고유한 논리를 소유하고 있는 전적인 '심리역학', 정신적 자동기계 혹은 랑그의 언표 가능한 것enoncable을 구성한다. 랑그는 이로부터 단위와 기표적 조작을 갖는 언어적 언표들을 이끌어내지만, 언표 가능한 것 그 자체, 그리고 그것의 이미지와 기호들은 다른 본성을 갖는 것들이다. 이것이 바로 옐름슬레우가 비-언어적으로 형성된 '질료matiere'라 부른 것이며, 반면에 랑그란 형태forme와 실체substance를 통해 작동하는 것이다. 혹은 오히려, 귀스타브 기욤이 언어학의 조건으로 삼았던, 모든 기표화 이전에 있는 최초의 기표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기호학과 기호론이 통과해간 모호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언어학적 영감에 기반을 둔 기호학은 '기표'를 그 자신에 가두고, 언어를 그것의 최초의 질료를 구성하는 이미지와 기호로부터 단절시킨다. 반대로 우리가 기호론이라 부르는 것은 이미지와 기호라는 이 특이한 질료와의 관계를 통해서만 언어를 고찰하는 분과이다. 물론 언어가 질료 혹은 언표 가능한 것을 독점하게 될 때, 언어는 이것들을 더 이상 이미지 혹은 기호로 표현될 수 없는 순수하게 언어적인 언표들로 만들어버린다. 그렇지만 이제 언표들조차 그 자신들이 이미지와 기호로 재투여되고, 그래서 새롭게 언표 가능한 것을 공급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 우리가 보기에 영화는 바로 자동기계적인 혹은 심리역학적인 자질을 통해 전언어적인 이미지와 기호의 체계가 되었고, 이 체계에 고유한 이미지와 기호 내로 언표들을 재포획했던 것 같다(무성영화의 읽혀진 이미지, 유성영화의 초기단계에서 시각 이미지가 갖고 있던 음향적 구성요소, 유성영화의 두 번째 단계에서의 음향 이미지 그 자체). 바로 이러한 이유로 무성영화와 유성영화의 단절은 영화의 진화에 있어 결코 본질적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반면에 이 이미지와 기호의 체계에서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보였던 것은, 자신에 상응하는 기호를 갖는 두 종류의 이미지 구분, 즉 운동-이미지와 그 이후에만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혹은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시간-이미지의 구분이다. 운동구조와 시간발생은 순수한 기호론이 펼쳐지는 두 연속적인 장이다.
심리역학 혹은 정신적-자동기계로서의 영화는 그 고유한 내용, 주제, 상황,인물들을 통해 반성된다. 그러나 이 반성은 해소 혹은 화해를 발생시키는 만큼이나 대립, 전도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 관계는 단순하지 않다. 자동기계는 투쟁 관계에 들어갈 때조차 항상 공존하면서 서로 상보적인 두 방향을 갖고 있었다. 한편으로 이 거대한 정신적 자동기계는 가장 고양된 사유의 훈련, 즉 사유가 자율성의 가공할 노력을 통해 무엇인가를 사유하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을 사유하는 방식을 드러낸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장-루이 셰페르는 우리 머리 뒤쪽에 있는 거인, 실험용 잠수인형, 꼭두각시 혹은 기계, 세계를 일순간 정지상태에 놓을 기계적인 인간, 탄생 없는 인간으로서 영화에 공신력을 부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자동기계는 더 이상 외부에 의존하지 않는 심리적인 자동기계인데, 그것이 외부에 의존하지 않는 이유는 이 자동기계가 자율적인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고유한 사유로부터 박탈된 것, 그래서 단지 가장 초보적인 비전들 혹은 행동들만을 통해 전개되는 내적 흔적에 복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몽상가에서 몽유병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역으로 최면, 암시, 환각, 고정관념 등의 중계를 통해). 바로 여기에 연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영화에 고유한 어떤 것이 존재한다. 영화가 정신적 예술이 된 자동운동, 즉 무엇보다도 운동-이미지라 한다면, 영화는 우연적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자동기계와 대면한다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연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영화에 고유한 어떤 것이 존재한다. 영화가 정신적 예술이 된 자동운동, 즉 무엇보다도 운동-이미지라 한다면, 영화는 우연적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자동기계와 대면한다는 것이다. 프랑스 유파는 시계추적 자동기계, 시계부품과 같은 인물들에 대한 취향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겠지만, 또한 미국 유파나 소비에트 유파처럼 운동기계와도 대면하게 될 것이다. 인간-기계의 조합은 경우에 따라 다양하게 변주될 것이지만, 그것은 항상 미래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일 것이다. 또한 기계주의가 인간의 심장까지 상승하여 올라가 인간의 가장 오래된 역량들을 깨우거나, 또 운동기계가 가공할 새로운 질서에 봉사하는 순수하고 단순한 심리적 자동기계와 전적으로 일치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칼리가리 박사의 밀실>에서 <메트로폴리스>,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로봇을 거쳐 <마부제 박사의 유언>으로 이어지는, 표현주의에서의 몽유병자들, 즉 환각에 사로잡힌 사람들, 최면술사-최면에 걸린 사람들의 행렬이다. 독일 영화는 원시적인 역량들을 소환했지만, 또한 어쩌면 이후 영화를 변모시킬, 혹은 영화를 끔찍스럽게 '연출'해낼, 그리고 그 소여 자체를 변형시킬 어떤 것을 예고하기에 가장 적합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 같다.
크라카우어의 저서 [칼리가리에서 히틀러까지]의 흥미로움은, 어떻게 독일 표현주의가 독일 영혼 속의 히틀러적인 자동기계의 상승을 반영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었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아직 외부적인 관점이 문제였던 반면, 발터 벤야민의 논문은 영화 내부에 직접 자리잡아 어떻게 자동기계적 운동의 예술이(혹은 벤야민이 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기술복제의 예술이) 그 자신, 대중의 자동기계화, 국가의 미장센, '예술'이 된 정치와 일치될 수 밖에 없었나를 보여준다. 시네아스트로서의 히틀러... . 그리고 사실, 마지막 순간까지 나치즘은 자신이 할리우드와 경쟁관계에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운동-이미지와 주체로서의 대중예술의 혁명적인 결합은 심리적 자동기계로서의 종속적인 대중, 그리고 거대한 정신적 자동기계로서의 수장에게 자리를 내주고는 파기되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로 지버베르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운동-이미지의 귀결은 레니 리펜슈탈이다. 그리고 만약 히틀러에 대한 재판이 영화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히틀러를 향해 히틀러의 무기를 돌려 겨누면서 그를 영화적으로 무찌르기" 위하여 영화 내부에서, 시네아스트 히틀러에 대항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마치 지버베르크 자신이 크라카우어의 책에 두 번째 권을 덧붙이고자 원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두 번째 권은 책이 아닌 영화가 될 것이다. 더 이상 칼리가리에서(혹은 하나의 독일 영화에서) 히틀러까지가 아닌, 히틀러에서 <한 편의 독일영화>까지, 히틀러에 대항하여, 그리고 또한 할리우드, 재현된 폭력, 포르노그라피와 상업주의...에 대항하여 변화가 영화 내부에서 함께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일 것인가? 새로운 연합 위에 심리역학을 세움으로써만, 그리고 히틀러가 차지해버렸던 위대한 정신적 자동기계를 재건하고, 그가 노예화해버렸던 심리적 자동기계를 다시 살려냄으로써만 우리는 진정한 심리역학을 재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영화에 종속적인 형태로 남아 있던, 그그리고 아직 자신의 효과를 펼칠 시간을 갖지 못했던 다른 역량들, 즉 투사, 투명성 등을 해방하기 위해, 영화가 그 초기부터 운동과 이미지 사이에 도입했던 관계, 즉 운동-이미지를 포기해야만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실상 더 일반적인 질문이 문제시되고 있다. 왜냐하면 투사, 투명성은 직접적으로 시간-이미지를 운반하면서 운동-이미지를 시간-이미지로 대체하는 기술적인 방식일 따름이기 때문이다. 배경은 변모된다. 그러나 그것은 "여기서 공간은 바로 시간으로부터 태어나기" (<파르시팔>) 때문이다. 이것은 자동운동과 같은 어떤 새로운 이미지의 체제인가?
물론 여기에는 자동기계의 기술적, 사회적 진화라는 외재적인 관점으로 다시 돌아가보는 작업이 요청된다. 기존의 시계장치 자동기계, 그리고 동력장치 자동기계, 즉 간단히 말해 운동의 자동기계들은 정보적이고 사이버네틱한 새로운 종, 즉 계산과 사유의 자동기계, 조정과 피드-백의 자동기계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권력 또한 자신의 형상을 바꾸어 행동의 명령자로서의 단일하고 신비로운 지도자, 꿈을 불어넣는 자에게로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결정권자들'이 불면자들과 투시자들의 교차지점을 통과하여 조정, 처리, 저장 등을 관리하는 정보망 속으로 확산되었다(이것이 예를 들어 우리가 리베트의 영화나 고다르의 <알파빌>에서 보았던 전지구적 음모, 루멧 영화에서 볼 수 있는 도청과 감시 체계, 그리고 무엇보다도 랑의 세 명의 마부제의 발전과, 특히 전후 독일로 귀환한 세 번째 마부제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때로는 아주 명확한 형태로, 새로운 자동기계들이 최선에서 최악에 이르기까지 영화를 채우게 되었고(그 최선의 경우란 큐브릭의 < 2001>에서의 거대한 컴퓨터일 것이다), 특히 SF를 통해 과거 진퇴유곡에 빠진 운동 이미지가 잠정적으로 제거했던 거대한 미장센의 가능성을 영화에 다시 부여했다. 그러나 새로운 자동기계들은, 새로운 자동운동이 형식의 변형을 보증하지 않는 한 그 내용을 점령하지 못한다. 자동기계의 현대적인 형상은 전자기적 자동기계의 상관물이다. 전자기적 이미지, 즉 텔리비전이나 비디오의 이미지, 그리고 이제 태동중인 디지털 이미지는 영화를 변형시키거나 영화를 대체하고 그 죽음을 선언했음에 틀림없다. 이 새로운 이미지에 대한 분석은 우리의 책의 의도를 넘어서기에 이를 시도하지는 않겠지만, 단지 영화 이미지와의 관계를 통해 한정해둘 필요가 있는 몇몇 효과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새로운 이미지들은 이데 더 이상 외재성(화면 밖 영역)을 갖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체 속에서 내재화되지도 않는다. 이 이미지들은 오히려 자기 자신으로 회귀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역전 가능하지만 포개질 수는 없는 겉면과 이면을 갖고 있다. 이 이미지들은, 앞선 이미지의 어떤 지점에서도 새로운 이미지가 생겨날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인 재조직화 대상들이다. 여기서 공간의 조직은 특권적 방향을 상실하는데, 특히 끊임없이 각도와 좌표를 변경하고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것이 교환되는 전방위적인 공간을 위해 여전히 스크린의 위치를 증언하고 있는 수직선이 갖고 있는 특권을 상실한다. 스크린 자신, 관습적으로는 여전히 수직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창문이나 그림과 같은 인간적 형세로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정보적인 표, 자연을 대체하는 정보와 자연의 시선을 대체하는 뇌-도시, 제3의 눈과 같은 '소여들'이 기입된 불투명한 표면을 구성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음향적인 것은 점점 더 이미지의 지위를 자신에 부여해줄 자율성을 획득하게 되고, 그리하여 이러한 자율성을 통해 음향적인 것과 시각적인 것이라는 두 이미지들은 이제 서로 종속되지도, 공약 가능하지도 않은 복잡한 관계를 형성하여, 이들 각각은 자신의 고유한 한계에 도달하면서 공통의 한계에 이르게 된다. 이 모든 의미에서, 새로운 정신적 자동운동은 이제 새로운 심리적 자동기계로 귀착된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다음과 같은 질문 주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뇌의 창조인가 혹은 소뇌의 결함인가? 만약 새로운 자동운동이 아직은 모호하고 농축적인 상태에 있는 어떤 강렬한 예술의지를 위해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의지를 제약하지 않을 무의지적인 운동에 의해 펼쳐지기를 열망하면서 이 의지를 위해 사용되지 않는다면, 이 새로운 자동운동은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영화 그 자체의 인지적 질료에 영향을 미쳤던 변화, 즉 시간-이미지에 의한 운동-이미지의 대체라는 변화 속에서 정의했던 독창적인 예술의지 말이다. 결국 전자기적 이미지들은 다시 한번 도 다른 예술의지, 혹은 아직은 밝혀지지 않은 시간-이미지의 양상들에 기반을 두어야만 할 것이다. 예술가란 항상 다음과 같은 말을 동시에 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 나는 새로운 수단을 원한다, 동시에 나는 이 새로운 수단이 모든 예술의지를 무효화시키지는 않을지, 혹은 상업, 포르노그라피, 히틀러주의적인 것이 되지는 않을지 두렵다. 중요한 것은, 영화 이미지는 전자기적 이미지의 효과와는 전혀 닮지 않은, 그러나 예술의지로서의 시간-이미지에서 예상할 수 있었던 자율적 기능을 갖는 효과들을 이미 쟁취해냈다는 것이다. 이렇게, 브레송의 영화는 정보적 혹은 사이버네틱한 기계들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모델'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운동적 행위가 아니라, 발화 행위와의 관계 속에서 정의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대적인 심리학적 자동기계이다(브레송은 지속적으로 자동운동에 대해 성창한다). 마찬가지로 로메르의 마리오네트적인 인물들, 로브-그리예의 최면에 걸린 자들, 레네의 좀비들은 에너지와 운동기능성이 아닌, 말의 기능 혹은 정보의 기능에 의해 정의되는 것들이다. 레네의 영화에 존재하는 것은 더 이상 플래시백이 아닌, 특별한 기계 조작조차 필요로 하지 않는, 피드백과 피드백의 실패라 할 수 있다. p.515-522
그러나 프레임 혹은 스크리닝 테두리 쳐진 도표 또는 인쇄물 혹은 정보표처럼 기능할 때, 이미지는 끊임없이 다른 이미지 속에서 재단되고, 가시적인 직조를 통해 압인되며, "끊임없는 메시지의 흐름"속에서 다른 이미지들로 미끄러져감으로써, 쇼트 그 자체는 눈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끊임없이 정보를 빨아들이는 과부하된 뇌와 흡사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눈-자연을 대체하는 뇌-정보, 뇌-도시의 쌍이다. 고다르는 비디오라는 수단을 사용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했다(<결혼한 여인><그녀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두세 가지 것들>). 또한 스트로브, 마르그리트 뒤라스, 지버베르크의 영화에서 음향적 프레임화, 음향 이미지와 시각 이미지의 분리는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도움을 요청하는 대신, 영화적인 수단 혹은 단순한 비디오의 수단만을 사용하고 있다. 그것은 단순하게 경제적인 이유 때문만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정신적 자동운동, 그리고 새로운 심리적 자동기계란 테크놀로지에 의존하기 앞서 하나의 미학에 의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자기적인 것이 이미지와 기호의 독창적 체제를 망치기 전, 혹은 역으로 이를 시동하기도 전에, 이 이미지와 기호의 독창적 체제를 요청한 것은 바로 시간-이미지이다. 장-루이 셰페르가 영화의 원칙으로서의 위대한 정신적 자동기계 혹은 우리 머리 뒤쪽의 허수아비를 얘기할 때, 그는 온당하게도 현재 이를 모든 신체의 운동기능 이전에 존재하는, 시간에 대한 직접적 체험을 하는 두뇌라 정의하고 있다. (비록 그가 예를 들고 있는 드레이어의 <벰파이어>의 풍차가 여전히 시계장치류의 기계장치로 귀착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각자 서로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스트로브, 마르그리트 뒤라스, 그리고 지버베르크를 하나의 전체적인 시-청각적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기획 속에서 여러번 결합했던 것은 정당한 것처럼 보인다. 사실상 지버베르크의 영화에서 우리는 이미 다른 시네아스트들에게서 추출하려 했던 커다란 두 가지 특성을 다시 발견하게 된다. 먼저 음향적인 것과 시각적인 것의 분리는 <왕의 요리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요리사의 끊임없는 말의 유출과, 버려진 텅 빈 공간, 성, 오두막집, 그리고 때로 판화 사이에서 명백하게 나타난다. 혹은 <히틀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버려진 수상 관저라는 시각적 공간이 있는 반면, 한쪽 구석에 위치한 아이들은 히틀러의 연설이 흘러나오는 디스크 판을 듣게 한다. 이러한 분리는 지버베르크의 스타일이 갖는 고유한 측면들을 보여준다. 때로 이것은 말해진 것과 보여진 것의 객관적인 분리해체를 지시한다. 정면 투사와 슬라이드의 빈번한 사용은 배우 자신이 바라볼 수는 없지만, 자신의 말과 몇 가지 소도구로 축소된 채, 이 공간에 속하지 않으면서 연합되어 있는 시각적 공간을 보증한다. 또한 때로 이것은 목소리와 신체의 주관적인 분리해체를 나타낸다. 그렇게 신체는 배우 혹은 낭송자의 목소리와 대면하고 있는 마리오네트, 꼭두각시에 의해 대체되는 것이다. 혹은 <파르시팔>에서처럼, 되감기 장치는 완벽하게 소리와 동시녹음되어 있지만, 이때 신체는 남자 목소리를 내는 소녀의 신체나, 하나의 목소리를 공유하는 두 신체처럼 살아 있는 마리오네트와 같은 그 자신이 부여하는 목소리에 낯선 채로 남아 있다. 이것은 이제 전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신체와 목소리로의 분리가 "단일한 개인에 의해서는 재현될 수 없는", "그 자체 분열된, 그리고 비-심리학적인 양태를 갖는 출현"으로서의 이미지의 발생을 형성하는, "파열"으로서의 체제이다. 마리오네트와 낭송자, 신체와 목소리는 전체를 구성하거나 혹은 개인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기계를 구성한다. 이것은 저 깊은 데서 분열된 프시케의 본질이라는 의미에서 심리학적 자동기계이다. 비록 이러한 분열을 비기계적인 개별자의 상태로서 해석할 때의 의미에서 심리학적이라는 것은 결코 아니라 할지라도 말이다. 클라이스트에서처럼, 혹은 일본 연극에서처럼, 영혼이란 '내면의 목소리'와 한 패를 이루는 마리오네트의 '기계적 움직임'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분열이란 이렇게 그 자체 즉자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긴 하지만 대자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로, 창조적인 이야기 꾸며대기 혹은 전설화하기로서의 순수한 바롸 행위는 발언된 모든 정보들로부터 벗어나야 할 뿐만 아니라(그 가장 놀라운 예는 자신의 거짓말과 그 거짓말의 고발을 통해 전설이 된 <칼 마이>이다), 모든 시각적 소여들 또한 발화 행위가 빠져나와 다른 편으로 비상하게 될, 다양한 노출들, 역작용의 관계, 추동력, 함몰, 붕괴, 잔해화 등과 더불어 겹쳐지고 끊임없이 뒤섞이는 지층들로 조직화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이것이 바로 루드비히, 칼 마이, 히틀러로 이어지는 3부작에 상응하는 독일사의 세 지층, 그리고 각 영화에 나타나는 지층과도 같은 슬라이드의 겹침으로서, 그 마지막 지층은 '얼어붙고 살해된 풍경', 즉 세계의 종말이다). 마치 발화 행위가 융기하기 위해서는 세계가 깨어져 함몰되기라도 해야만 한다는 듯이 말이다. 지버베르크의 영화에는 스트로브와 뒤라스에게서 보았던 것과 유사한 무엇인가가 발생한다. 음향적인 것과 시각적인 것은 전체를 재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두 비대칭적인 궤도를 따라 '무리수적인' 관계로 들어간다. 시-청각적 이미지는 전체가 아니라, '파열의 융해'인 것이다.
그러나 지버베르크의 독창성 중의 하나는 상투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역사적인 것과 삽화적인 것, 상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복합적이고 이질적이며 무정부적인 공간으로서의 거대한 정보공간을 펼쳤다는 것에 있다. 그리하여 때로 담론, 주석, 가족 혹은 하녀의 증언과 같은 말의 측면에서, 또 때로는 존재하거나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환경, 판화, 지도의 설계, 투시력을 가진 비전 등의 시각의 측면에서, 모든 것은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며, 이 모든 것은 결코 인과론으로 환원되지 않는 관계를 갖는 어떤 조직망을 형성한다. 현대 세계는 정보가 자연을 대체한 세계이다. 이것이 바로 장-피에르 우다르가 지버베르크의 '미디어-효과'라 부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지버베르크의 작품이 갖는 본질적 측면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시각적인 것과 음향적인 것의 분리, 분열이란 바로 이 정보적 공간의 복합성을 표현해야 할 책무를 띄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복합성이 하나의 전체라는 것이 가능할 수 없게 하며 그런 만큼 이것은 심리적 개체성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것은 총체화될 수 없는, '단일한 개인에 의해서는 재현될 수 없는', 그리고 자동기계 속에서만 자신의 표상을 구할 수 있는 복합성인 것이다. 지버베르크가 상정한 적은 히틀러의 이미지이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 히틀러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개인 히틀러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인과론의 관계에 의거해 히틀러를 생상해낼 수 있을 총체성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우리 안의 히틀러"란 단지 그가 우리르 만들었듯 우리가 히틀러를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우리 모두 또한 잠재적인 파시스트적 요소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히틀러는 우리 자신 안에 그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정보를 통해서만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나치 체제, 전쟁, 유태인 수용소는 이미지가 아니라고, 그리고 지버베르크의 입장에는 모호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버베르크가 보여주는 강렬한 생각은, 어떤 정보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히틀러를 무찌르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모든 자료들을 보여주고 모든 증언들을 듣게 해도 소용없을 것이다. 정보를 전능하게 만드는 것(신문과 라디오, 그리고 이어 텔레비전)은 그것의 무용성 자체, 그것의 근본적인 비효율성이다. 정보는 자신의 역량을 정초하기 위해 자신의 비효율성을 갖고 장난하지만, 그 역량 자체는 비효율적인 것이 되는 것이고 이를 통해 더더욱 위험스러운 것이 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히틀러를 무찌르기 위해서는 정보를 뛰어넘거나 혹은 이미지를 전복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보를 뛰어넘는다는 것은 동시에 두 측면으로 다음과 같은 두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무엇이 원천이고, 또 수신자는 누구인가? 이것은 또한 고다르의 교육법이 제기했던 두 질문이기도 하다. 정보는 이 두 질문 어느 것에도 응답하지 않는데, 그것은 정보의 원천이란 정보가 아니며 정보의 증인 도한 아니기 때문이다. 정보의 쇠락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보 그 자체가 쇠락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발화된 정보들을 뛰어넘어, 그로부터 지배적인 신화와 현행하는 말들과 그 지지자들의 역으로서 존재하는, 순수한 발화 행위, 창조적인 이야기 꾸며대기를 추출해내야, 즉 신화로부터 이익을 끌어내거나 그것을 착취하는 대신 신화를 창조할 수 있는 행위를 추출해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모든 시각적 지층들을 뛰어넘어, 폐허의 잔해들로부터 빠져나와 세계의 끝에 이르기가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래서 자신의 가시적인 신체에 순수한 발화 행위를 수용할 수 있는 순수한 증인을 세워야 하는 것이다. <파르시팔>에서 이 첫 번째 측면은 송가로서의 발화 행위에 창조적 기능, 즉 신화의 역량을 부여하는 바그너의 거대한 머리로 귀결되는데, 루드비히, 칼 마이, 그리고 히틀러는 단지 이 신화의 하찮은 혹은 퇴폐적인 용도, 쇠락일 뿐이다. 또 다른 측면은, 그 또한 거대한 머리에서 빠져나와 모든 시각적 공간들을 통과해가면서, 세계의 종말의 마지막 공간에 분열되어 솟아나는 <파르시팔>로 귀결되는데, 이 때 머리는 그 자체로 분열되고, 또 파르시팔의 딸은 자신의 존재 전체로 구원의 목소리를 송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수신한다. 시각적인 것과 음향적인 것의 비합리적 순환은 지버베르크를 통해 정보와 정보의 초월로 이끌어진다. 구원, 인식 너머의 예술, 그것은 또한 정보 너머의 창조이다. 구원은 항상 너무 늦게 오고(이것이 바로 비스콘티와 지버베르크의 공통점이다), 정보가 이미 발화 행위를 휩쓸어버리고 난 후, 그리고 히틀러가 이미 신화 혹은 독일적 비합리성을 포획해버리고 난 후에야 도래한다. 그러나 이 너무 늦음은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것은 시간이 공간의 지층을 보게 하고, 발화 행위의 이야기 꾸며대기를 듣게 하는, 시간-이미지의 기호이다. 영화의 생명 혹은 살아남음은 그 자신, 정보적인 것과의 내적인 투쟁에 달려 있다. 정보적인 것에 대항하여, 이를 초월하는 질문, 즉 원천과 수신자에 대한 질문, 정신적 자동기계로서의 바근어ㅢ 머리와 심리적 자동기계로서의 파르시팔 커플을 바로 일으켜 세워야 할 것이다. p.523-528
이제 현대영화에서 이 시간-이미지의 구성과 그것이 함축하고 있는, 혹은 그것이 정초한 새로운 기호들을 요약하는 일이 남은 것 같다. 운동-이미지와 시간-이미지 사이에는 많은 가능한 전이, 거의 지각 할 수 없는 이행, 혹은 혼합조차 존재한다. 우리는 또한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고, 혹은 더 아름답거나 심오하다고 말할 수 없다. 단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운동-이미지는 시간-이미지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운동-이미지는 바로 이 점에서 아주 많은 것을 준다. 한편으로 운동-이미지는 자신의 경험적 형태 속에 시간, 혹은 시간의 흐름, 즉 과거란 이전의 현재이고, 미래란 이제 올 현재라는, 이전과 이후의 외재적 관계에 따르는 연속적인 현재를 구성한다. 영화 이미지란 필연적으로 현재에 속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불완전한 성찰에 불과할 것이ㅏㄷ. 그러나 영화에 대한 모든 이해를 파괴할 만한 이 기정사실화된 생각은 운동-이미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너무 성급한 성찰 탓이다. 왜냐하면 다른 한편으로 운동-이미지는 이미 경험적 흐름으로서의 현재를 넘어서, 혹은 그 기저에서, 과잉 혹은 결함을 통해 자신과 구분되는 시간의 이미지가 생겨나도록 촉구했기 때문이다. 이제 시간은 더 이상 운동에 의해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 운동의 수치 혹은 단위(형이상학적 재현)가 된다. 그리고 이 수치는 이제 우리가 앞서 [시네마 1: 운동-이미지]에서 보았던 것처럼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다. 즉 수치는 운동의 간격으로서의 시간의 최소단위이거나, 혹은 우주 내의 운동의 최대치로서의 시간의 총체성이라는 것이다. 섬세와 숭고. 그러나 이런저런 측면을 통해 봤을 때, 여기서 시간은 이렇게 간접적 재현으로서만 운동과 구별된다. 흐름으로서의 시간은 운동-이미지 혹은 연속적인 쇼트들로부터 흘러나온다. 그러나 통일성 혹은 총체성으로서의 시간은 자신을 다시 한번 운동 혹은 쇼트의 연속성으로 이끌어가는 몽타주에 의존한다. 이것이 왜 그토록 운동-이미지가 시간의 간접적 재현에 근본적으로 연관되고, 우리에게 시간에 대한 직접적인 현시를 주지 않는지, 즉 시간-이미지를 주지 않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 때 유일한 직접적 현시는 음악 속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잇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현대영화에서 시간-이미지는 더 이상 경험적이지도 형이상학적이지도 않다. 그것은 칸트적 의미에서 '초월론적'인 것이다. 즉 시간이란 경첩에서 빠져나가 순수한 상태로 스스로 현전하는 것이다. 시간-이미지는 운동의 부재를 함축하는 것이 아니라(비록 종종 운동의 희소화를 포함하기는 하지만) 종속관계의 전복을 함축한다. 그리고 더 이상 시간이 운동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 시간에 운동이 종속된다. 또한 더 이상 시간이 운동과 운동의 규범, 그리고 운동의 일탈의 교정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짓 운동, 일탈적 운동으로서의 운동이 시간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시간이 새로운 양상들을 발견하고, 운동이 우연적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일탈적인 것이 되고, 몽타주가 새로운 의미를 취하며, 소위 현대적인 영화가 전후에 구성되면서, 시간-이미지는 직접적인 것이 된다. 현대영화가 고전 영화와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할지라도, 이제 현대 영화가 새롭게 제기하게 되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이미지에 작용하는 새로운 힘들, 스크린에 범람하는 새로운 기호들은 무엇일까?
그 첫번째 요소는 감각-운동적 관계의 단절이다. 그것은, 운동-이미지란 간격과 관계하자마자 행동-이미지를 구성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행동-이미지는 그 가장 넓은 의미에서 수용된 운동(지각, 상황), 흔적(감정, 간격 자체), 실행된 운동(고유한 의미의 작용 혹은 반작용)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감각-운동적 연쇄는 운동과 그 간격의 통일성, 운동-이미지의 특화, 또는 무엇보다도 행동-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첫 번째 계기에 상응하는 서사적인 영화에 대해서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서사란 감각-운동적 연쇄로부터 유출되는 것이지 그 역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후, 이 행동의 영화에 의문을 제기한 것은 바로 감각-운동적 구조, 그 자체의 단절이다. 우리가 더 이상 반응할 수 없는 상황, 우연적인 관계만이 존재하는 환경, 특질화된 공간의 연장을 대체한 텅 비거나 탈접속된 임의의 공간의 등장이 그것이다. 이렇게 상황은 운동-이미지의 요구에 부응하는 행위 혹은 반작용으로 더 이상 연장되지 않게 된 것이다. 이것은 인물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순수한 시지각적, 음향적 상황,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에 막연히 무관심한, 해야 할 것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한, 인물이 탈주하고 소요하고 왕래하기 위해 느끼고 행동하기를 멈춘 방기된 공간들이다. 그러나 인물은 자신이 행동 혹은 반작용에 있어 잃어버린 것을 투시력을 통해 되찾는다. 그는 바라본다. 그래서 결국 관객의 문제는 (더 이상 '다음 이미지 안에서 무엇을 보게 될 것인가?'가 아니라) '이미지 안에 봐야 할 무엇인가가 있는가?'가 되는 것이다. 상황은 이제 더 이상 감정을 매개로 하여 행동으로 연장되지 않는다. 상황은 모든 연장으로부터 단절되어, 모든 감정의 내포, 모든 행동의 외연을 흡수해버리고, 그 자체로서만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더 이상 감각-운동적 상황이 아니라, 견자가 행위자를 대체한 순수한 시지각적, 음향적 상황이다. 하나의 '묘사'라 할 수 있을. 우리는 소환할 수 있는 외재적 이유를 가질 뿐만 아니라(행동에 대한 문제제기, 바라보고 들어야 할 필요성, 텅 비고, 탈접속되고 버려진 공간의 증식 등), 네오리얼리즘, 누벨 바그, 뉴 아메리칸 시네마 등 스스로 자신들의 조건들을 재창조하면서 새로이 일어난 영화 내적인 추진력에 의해 이차대전 후 도래한 이 새로운 유형의 이미지들을 시지각기호, 음향기호라 지칭하고자 한다. p.528-532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현실태적 이미지가, 회상 혹은 꿈처럼 이후 현실화된, 자신과는 다른 잠재적 이미지와 관계를 맺는 상황, 즉 아직 여전히 연쇄의 양태를 갖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지 않다. 현실태적 이미지와 그 자신의 잠재태적 이미지의 상황, 결국 더 이상 현실적인 것과 상상적인 것의 연쇄가 아닌, 지속적인 교환의 와중에 있는 두 이미지의 식별 불가능성 속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시지각기호와 관련한 일종의 진보이다. 우리는 이미 어덯게 결정체가 묘사의 이중화를 보증하고, 상호적이 된 이미지 내에서의 교환, 즉 현실태와 잠재태, 투명한 것과 불투명한 것, 배아와 환경의 교환을 수행하는지를 보았다. 현실적인 것과 상상적인 것의 식별 불가능성에 이름으로써, 결정체적 기호들은 모든 행동의 물리학뿐만 아니라 회상과 꿈으로 이루어진 모든 심리학을 넘어서게 된다. 우리가 결정체 속에서 보는 것은 더 이상 현재의 연속으로서의 시간의 경험적 흐름이나, 간격 혹은 전체로서의 시간의 간접적 재현이 아니라 시간의 직접적 현시, 지나가는 현재와 보존되는 과거로 구성된 시간의 이중화, 현재와 이제 자신이 될 과거, 과거와 그 자신이었던 현재의 엄격한 동시대성이다. 바로 인격으로서의 시간이 결정체로부터 출현하여 끝없이 갱신하고 재생하는 식별 불가능한 교환으로 인해, 그 도달점을 갖지 않는 채 끊임없이 이중화로서의 분열을 계속하는 것이다. 직접적인 시간-이미지 혹은 시간의 초월론적 형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결정체에서 보는 것이다. 또 당연히 결정체적 기호들은 시간의 거울들 혹은 시간의 배아들이라 말해져야 할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직접적인 시간-이미지의 다양한 현시를 표시할 시간기호들chronosignes이 출현하게 된다. 그 첫 번째는 시간의 질서에 관계된다. 이 질서는 연속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간접적 재현에서의 간격 혹은 전체와도 혼동되지 않는다. 그것은 위상학적 혹은 양자적 형태를 띤, 시간의 내재적 관계에 해당되는 것이다. 첫 번째 시간기호는 또한 두 개의 형상을 갖는다. 때로 이것은 모든 과거의 시트들과 이 시트들의 위상학적 변형의 공존성, 그리고 세계-기억을 향한 심리적 기억의 지양으로 나타난다(이 기호는 시트, 양상, 혹은 인상이라 불릴 수 있다). 때로 이것은 모든 외재적 연속과 단절하고, 과거, 미래로 이중화된 현재와 현재 그 자체 사이에서 양자적 비약을 시행하는, 현재의 첨점들의 동시성으로 나타난다(이 기호는 첨점 혹은 액센트라 불릴 수 있다). 우리는 결정체-이미지를 특징지었던, 현실적인 것과 상상적인 것의 식별 불가능한 구분이 아닌, 이제는 직접적인 시간-이미지에 관계된, 과거의 시트들 사이의 결정할 수 없는 양자택일, 혹은 현재의 첨점들 사이의 '설명할 수 없는' 차이의 문제 속에 있게 된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더 이상 현실적인 것과 상상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과 거짓이다. 현실적인 것과 상상적인 것이 이미지에 대한 아주 분명한 조건들 속에서 서로 식별 불가능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진실과 거짓은 결정지을 수 없는 혹은 풀 수 없는 것이 된다. 불가능성이 가능성에 의해 진행되고, 과거는 필연적으로 진실이 아니다. 이것은 조금 전의 새로운 심리학과 마찬가지로 새로이 창조해야 할 새로운 논리학이다. 이 점에서 레네는 공존하는 과거의 시트의 방향에서 가장 멀리 나아갔고, 로브-그리예는 동시적인 현재의 첨점을의 방향으로 가장 멀리 나아간 것처럼 보인다. 바로 여기에서 이 두 체제의 특징을 동ㅅ시에 갖고 있는 <지난 해 마리엔바드에서>의 역설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시간-이미지는 이차대전 후 영화의 새로운 요소로서의 직접적인 혹은 초월론적인 현시를 통해 출현했으며, 이 시간 이미지의 거장은 바로 오슨 웰스이다.
여기에 계열로서의 시간을 구축하는 또 다른 형태의 시간기호가 존재한다. 이전, 이후는 더 이상 그 자신, 외재적인 경험적 연속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생성하는 것의 내재적인 특질에 해당된다. 사실상 생성이란 경험적 연속을 계열로 변형시키는 것이라 정의될 수 있다. 계열들의 질풍. 계열, 그것은 일련의 이미지들로서, 그러나 그 자신, 첫 번째 이미지의 연속(이전)을 국지화하고 고취하는 한계로 향해가면서, 이제 다른 한계로 향하는 계열로 조직된 또 다른 연속(이후)에 자리를 내준다. 그러므로 이전과 이후는 더 이상 시간의 흐름의 연속적인 결정화가 아닌, 역량의 두 측면 혹은 한 역량에서 또 다른 상위의 역량으로의 이행이라 할 수 있다. 직접적인 시간-이미지는 여기에서 공존성 혹은 동시성의 질서 속에서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화 혹은 역량의 계열로서의 생성 속에서 출현한다. 그러므로 이 두 번째 유형의 시간 기호, 즉 발생 기호는 또한 진리의 개념에 의문을 제기한다는 속성을 갖는다. 왜냐하면 거짓은 이제 단순한 외관 혹은 거짓말이기를 그치고, 한계를 뛰어넘어 변형을 시행하고 자신의 모든 여정에 전설, 이야기 구며대기의 행위를 펼치는 계열 혹은 정도를 구성하는 생성의 역량에 다다르고자 하기 때문이다. 진실과 거짓을 넘어, 거짓의 역량으로서의 생성. 발생기호는 이런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개의 형상을 갖는다. 때로 인물들은 웰스의 영화에서처럼, 세계가 하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는 '힘의 의지'의 정도 만큼으로서의 계열을 구성한다. 혹은 때로 인물을 그 자신, 한계를 뛰어넘어 자신을 과거의, 혹은 장차 올 민중과 맺어지도록 하는 이야기 꾸며대기의 행위를 통해 타자가 된다. 우리는 이미 이 영화가 모든 진실의 모델에 의문을 제기하는 바로 그 순간에 어떤 역설을 통하여 '시네마-베리테'라 불리게 되었는지를 보았다. 여기에는 중층화된 이중의 생성이 있다 할 것인데, 왜냐하면 작가 또한 자신의 인물과 마찬가지로 타자가 되기 때문이다(인물을 '중계자'로서 취하는 페로에게서나, 혹은 자신의 인물인 흑인이 백인이 되려는 것과 동시에, 또 다른 방식, 비-대칭적인 방식을 통해 흑인이 되려 하는 루쉬에게서처럼). 아마도 바로 여기에서, 이미 웰스에게서 볼 수 있었던 작가의 문제, 그리고 작가의 생성의 문제, 혹은 자신의 작가-되기의 문제가 가장 첨예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 같다. 세 번째로, 때로 인물들은 그들 자체로 해체되며, 작가는 지워진다. 여기에는 이제 계열을 형성하는 신체의 태도, 신체의 자세와 이들을 연결하는 한계로서의 게스투스만이 있을 뿐이다. 이것은 바로 행동이 태도에 의해 대체되고, 진실로 상정된 연쇄가 전설 혹은 이야기 꾸며대기를 하는 게스투스에 의해 대체된 만큼 더욱 더 감각-운동적 구조와 단절하게 된 신체의 영화이다. 마지막으로, 때로 계열들, 계열들의 한계와 변형, 역량의 정도들은 인물들, 한 인물의 상태, 작가의 위치, 신체의 태도, 그리고 또 색채, 미학적 장르, 심리적 능력, 정치적 권력, 논리적 혹은 형이상학적 범주 등, 이미지가 맺는 어떤 관계에도 관여할 수 있다. 한 범주에서 다른 범주로의 이행이 역량의 변화를 결정하는 것처럼 모든 일련의 이미지들은 그 자신을 반영하는 범주로 지향되는 어떤 하나의 계열을 형성한다. 불레즈의 음악을 가장 단순히 요약하는 다음과 같은 말은 고다르 영화에서도 유효할 것이다. 모든 것을 계열화했다는 것, 보편적인 계열성을 정초했다는 것. 이전과 이후는 한계의 양 측면을 구성하고 서로 나뉘어 분배된 두 게열 사이에서 한계로서 기능하는 모든 것을 범주라고까지 부를 수 있을 것이다(인물, 게스투스, 말, 색채는, 이들이 번성적인 조건을 완수하는 순간, 하나의 장르뿐만 아니라 하나의 범주가 될 수 있다). 만약 계열들의 조직이, 상상적인 것, 두려움, 매매, 음악으로 구성된 <삶, 각자 알아서 구하라>처럼 일반적으로 수평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계열이 스스로를 반영하는 한계 혹은 범주는, 이제 이 첫 번째 한게 혹은 범주와 겹쳐진, 그 자체 또 다른 상위의 역량을 갖는 계열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수난>의 회화적 범주, <그녀의 이름은 카르멘>의 음악적 범주가 그것이다. 이렇게 해서, 계열들의 수직적 구성은 공존성 혹은 동시성과 다시 조우하게 되고, 또 두 종류의 시간기호들을 결합하게 된다.
소위 고전적인 영화는 두 축을 따라 고려의 대상이 되었던 것 같다. 이 두 축은 뇌의 좌표들이다. 한편으로, 이미지들은, 연합, 인접성, 유사, 대조 혹은 대립의 법칙에 따라 연쇄되거나 연장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연합된 이미지들은 개념으로서의 전체 속에서 내재화되었고(통합), 역으로 전체는 연합 가능한 혹은 연장 가능한 이미지들 속에서 끊임없이 외재화되었다(분화). 바로 이러한 이유로 전체는 열려 있고 변화하였으며, 동시에 한 이미지의 집합은 항상 더 큰 집합에서 추출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화면 밖 영역을 정의하는 운동-이미지의 두 측면이다. 한편으로 운동-이미지는 왜부와 소통하며, 다른 한편으로 이미지는 변화하는 전체를 표현한다. 연장 속의 운동은 즉각적인 소여이며, 변화하는 전체, 즉 시간은 간접적 혹은 중계된 재현이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전체에서의 내재화와 이미지에서의 외재화, 혹은 철학뿐만 아니라 영화에 있어서도 총체화로서의 진실의 모델을 구성했던 원 혹은 나선 구도와 같은, 둘 사이의 순환이 끊임없이 존재했었다. 이 모델이 고전 이미지의 정신기호에 영감을 주었던 것이고, 따라서 필연적으로 두 종류의 정신기호가 존재했던 것이다. 첫 번째 정신기호에 따르면, 이미지들은 유리수적인 절단을 통해 연쇄되고, 이러한 조건 속에서 연장 가능한 세계를 형성하였다. 두 이미지 혹은 일련의 두 이미지들 사이에서, 간격으로서의 한계는 한 이미지의 끝 혹은 다른 이미지의 시작, 첫 번째 연속의 마지막 이미지 혹은 두 번째 연속의 첫 이미지로서 이해된다. 또 다른 종류의 정신기호는 전체 내에 이미지들의 연속의 통합(내적 재현에 대한 지가 의식화)뿐만 아니라, 연장된 연속들에서의 전체의 분화(외부세계에 대한 믿음)를 나타낸다. 그리고 전자에서 후자로 이미지들이 운동해감과 동시에 전체는 끊임없이 변화하였다. 이렇게 해서 운동의 치수로서의 시간은 간격과 전체의 이중적 형태 아래 공약 가능성의 일반적 체계를 보증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고전영화의 찬란함이었다.
현대영화는 '공약 불가능성' 혹은 무리수적 절단의 체제를 연다. 즉 절단은 자신이 분리하고 분배하는 어떤 이미지, 혹은 이미지들의 연속의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는다. 바로 이러한 조건 속에서, 이미지의 연속 혹은 시퀀스는 우리가 이미 분석한 의미에서의 계열이 된다. 간격은 해방되고 틈새는 환원될 수 없게 되며 그 자체로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 첫 번째 결과로, 이제 이미지들은 더 이상 유리수적 절단을 통해 연쇄되는 것이 아니라 무리수적 절단에 의해 재-연쇄된다. 우리는 이미 고다르의 계열들을 그 예로서 제시했는데, 그러나 도처에서, 특히 레네의 영화에서 이 예들을 찾아볼 수 있다(<사랑해 사랑해>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이 그 주위를 선회하여 다시 지나가게 되는 순간은 전형적인 무리수적 절단을 이룬다). 이 재-연쇄란 덧붙여지는 이차적 연쇄가 아니라 독창적이고 특이한 연쇄의 양태, 혹은 무엇보다도 탈연쇄된 이미지들 사이의 특이한 관계로서 이해되어야만 할 것이다. 더 이상 외부적인 세계를 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혹은 가능한 연장에 대해 말할 수 없다. 우리는 이미 이를 더 이상 믿지 않게 되었고, 이미지는 외부세계로부터 단절되었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자기의식화로서의 전체 속으로의 내재화 혹은 통합은 사라진 것이 아니다. 재-연쇄는 단편화를 통해 행해지는데, 이것은 고다르 영화에서는 계열들의 구조, 또는 레네의 영화에서는 시트들의 변형과 관계된다(재-연쇄된 단편화). 바로 이러한 이유로 사유는 항상 존재하지는 않았던 역량으로서의 모든 외부세계보다 더 먼 바깥으로부터 태어나고, 또한 아직 존재하지 않는 역량으로서의 모든 내부세계보다 더 심오한 안, 사유할 수 없음, 혹은 비사유와 대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더 이상 내재화 혹은 외재화의 운동, 통합 혹은 분화의 운동이 아닌, 거리에서 독립한 안과 바깥의 대면, 사유 자신 밖의 사유, 그리고 사유 안의 비사유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웰스의 환기할 수 없음, 레네의 결정할 수 없음, 로브-그리예의 설명할 수 없음, 고다르의 공약 불가능성, 스트로브의 화해할 수 없음, 마르그리트 뒤라스의 불가능함, 지버베르크의 비합리적인 것이다. 뇌는 유클리드적인 좌표를 상실해버렸고, 이제는 전혀 다른 기호들을 송신한다. 사실 직접적인 시간-이미지의 정신기호는 연쇄되지 않은 이미지들 사이의 무리수적 절단(그러나 항상 재-연쇄되는)과의 총체화할 수 없는, 비대칭적인 안과 바깥의 절대적인 접촉이다. 우리는 아주 쉽게 전자에서 후자로 이행하는데 그 이유는, 안과 바깥은 무리수적 절단으로서의 한계의 두 측면이고, 두 이미지의 연속의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이 한계는 필연적으로 스스로에 안을 부여하는 자율적인 바깥으로서 나타나기조차 하기 때문이다. 한계 혹은 틈새, 무리수적 절단은 특히 시각 이미지와 음향 이미지 사이에서 발생한다. 이것은 몇 가지 새로움 혹은 변화를 함축하고 있다. 음향적인 것은 시각 이미지의 한 구성요소가 아닌, 그 자체로 이미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음향적인 프레임화와 시각적인 프레임화, 이 둘 사이에서 절단이 발생하는 것과 같은, 하나의 음향적 프레임화의 창조가 필요한 것이다. 이제, 설령 화면 밖 영역이 실제로 잔존하고 있다 해도, 시각 이미지는 프레임화된 음향 이미지 자체와 특수한 관계를 맺기 위해 자신이 프레임 너머로 연장되기를 그치기 때문에, 화면 밖 영역은 모든 권리상의 역량을 상실할 수 밖에 없다.(화면 밖 영역을 대체하는 것은 두 프레임화 사이의 틈새이다). 또한, 채워야 할 화면 밖 영역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각각이 즉자적으로, 대자적으로, 그리고 자신의 프레임 내에서 존재하고 있는 두 이미지, 즉 목소리들의 이미지와 시선들의 이미지라는, 서로 대치하는 두 각기-자율적인 이미지들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이스-오프 또한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 두 종류의 이미지들은 서로 접촉하거나 조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플래시백, 즉 잠시 후 시각 이미지에 의해 복구될 것을 다소 보이스-오프된 목소리가 미리 환기하는 것과도 같은, 플래시백을 통해서가 아니다. 현대영화는 보이스-오프와 화면 밖 영역뿐만 아니라 플래시백 또한 제거하였다. 현대영화는 시각 이미지와 음향 이미지의 분리해체, 극복할 수 없을 이접관계, 즉 두 이미지 사이의 무리수적 절단을 제기함으로써만 음향 이미지를 쟁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 사이에는 자유간접적인 관계 혹은 공약 불가능한 관계가 존재하는데, 그것은 여기서 공약 불가능성이란 관계의 부재가 아닌 새로운 관계를 지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렇게 음향 이미지는 순수한 발화 행위, 즉 사건을 창조하고, 사건이 대기 속으로 솟아오르게 하며, 그 자신 정신적인 상승의 기운을 타고 융기하는 신화의 행위 혹은 이야기 꾸며대기 행위가 추출되어 나올 덩어리 혹은 연속성을 프레임화한다. 그리고 한편, 시각 이미지는 임의의 공간, 즉 새로운 가치를 갖는 텅 비거나 탈접속된 공간을 프레임화하는데, 그것은 이 공간이 사건을 지층학적인 층들 아래 파묻고, 또 끊임없이 다시 뒤덮일 지하의 불처럼 이 사건을 밑으로 하강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각 이미지는 음향 이미지가 언표하는 것을 결코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마르그리트 뒤라스에게서 최초의 무도회는, 이 두 종류의 이미지를 총체화하기 위한 플래시백을 통해서는 결코 다시 출현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두 이미지 사이에는 어떤 관계, 즉 연접 혹은 접촉이 존재한다. 이것은 발화 행위가 솟아나는 바깥과 사건이 대지 속으로 잠겨 들어가게 되는 안, 이 둘 사이의, 거리로부터 독립한 접촉이라 할 것이다. 이것이 음향 이미지 즉, 창조적인 이야기 꾸며대기로서의 발화 행위와, 지층적 혹은 고고학적 매장과 같은 시각 이미지의 상보성이다. 또한 총체화할 수 없는 관계, 접합이 끊어진 고리, 이들의 접촉이 갖는 비대칭적인 면들을 형성하는 이 두 이미지 사이의 무리수적 절단이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속적인 재-연쇄이다. 말은 자신을 시각적인 것으로부터 분리하는 고유한 한계에 이른다. 그러나 시각적인 것은 또한 자신을 음향적인 것으로부터 분리하는 고유한 한계에 이른다. 그러나 시각적인 것은 또한 자신을 음향적인 것으로부터 분리하는 고유한 한계에 이른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를 상대방으로부터 분리하는 자신의 한계에 다다름으로써 각자는 무리수적인 절단에 의한 공약 불가능한 관계, 즉 겉면과 이면, 안과 바깥의 관계를 통해 서로를 맺어주는 공통의 한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이 새로운 기호란 바로 직접적인 시간 이미지의 마지막 측면, 공통된 한계를 증언하는 가독기호이다. 지층적이 된 시각 이미지는 발화 행위가 자율적인 창조자가 된 만큼 더욱 더 가독적이게 된다. 고전영화에 이 가독기호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은 발화 행위가 무성영화에서 그 자신, 읽히거나 혹은 초기 유성영화에서처럼 시각 이미지의 한 구성요소로서 시각 이미지를 읽게 하는 한에서였던 것이다. 고전영화에서 현대영화로, 운동-이미지에서 시간-이미지로 이행해가면서 변화한 것은 단지 시간기호들만이 아니라 정신기호들과 가독기호들이기도 하다. 그것은 한 이미지의 체제에서 다른 체제로의 이행을 증식시키는 것은 이들 사이의 약분할 수 없는 차이를 강조하는 것만큼이나 항상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p.533-548
여기서 개념의 실천이란 일반적으로, 하나의 대상이 다른 대상에 대해 어떤 특권도 갖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개념들에 대해 어떤 특권도 갖지 않는다. 사물들이 형성되는 것은 수많은 실천들, 존재, 이미지, 개념, 즉 모든 종류의 사건들이 개입하는 층위에서이다.....영화의 개념들은 영화 속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영화에 대한 이론들이 아닌, 영화의 개념들이다. 그래서 결국 '영화란 무엇인가?'가 아니라 '철학이란 무엇인가?'라고 자문하게 되는 한 시간ㅇ 혹은 반 시간이 항상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영화 그 자신은 이미지와 기호에 대한 새로운 실천이며, 철학은 이를 개념의 실천으로서의 이론으로 만든다. 왜냐하면 어떠한 기술적 결정요인도, 응용된 결정요소도(정신분석, 언어학), 또한 반성적 결정 요인들도 영화 그 자체의 개념을 구성하는 데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언표를 둘러싸고 있는 공간을 분할하는 세 영역을 구분해야만 한다. 우선 동일한 집합에 속하는 여타의 언표들에 의해 형성, 연결 또는 인접되어 있는 하나의 방계적 공간이 있다. 여기서 이 공간에 의해 그 집합이 정의되는가, 또는 반대로 언표들의 집합에 의해 이 공간이 정의되는가라는 문제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이곳에는 언표들과 무관한 동질적 공간도 국지화 작용과 무관한 언표들도 존재하지 않으며, 양자는 형성 규칙의 층위에서 결합된다. 중요한 것은 이 형성 규칙들이, 명제의 경우처럼 일련의 공리로 환원되는 것도, 문장의 경우처럼 하나의 문맥으로 환원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명제들은 내재적 상수들을 결정하면서 동질적 체계를 정의해 주는 보다 상위의 층위에 속하는 일련의 공리들을 향하여 수직적으로 환원되는데, 이는 심지어 이런 동질적 체계들의 확립을 가능케 하는 언어학적 조건들 중 하나이다. 문장은 다양한 외재적 변수들이라는 기능에 준거하여 자신의 구성 부분들 중 몇몇을 다른 체계들로부터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언표는 이와는 전적으로 다르다. 언표는 우리를 하나의 체계 속에 머무르도록 허용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하나의 동일한 언어 내부에서조차) 하나의 체계에서 또 다른 하나의 체계에로 끊임없이 옮겨 가게 만드는, 어떤 고유한 변양작용으로부터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 언표는 편향되어 있는 것도 수직적인 것도 아니다. 언표는 횡단적인 것이며, 언표의 규칙은 언표 자체와 동일한 층위에 속해 있다. 아마도 푸코와 라보프는 서로 닮아 있는 것처럼 보인다. 라보프가 어떻게 한 흑인 청년이 "블랙 잉글리시"로부터 "미국 푲준 영어"에로 끊임없이 이동해 가는가를 보여 줄 때, 그리고 역으로, 결코 동질성들이 아니라, 그 규칙성들을 정의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주는 가변적 또는 임의적 규칙들 자체 아래에서 그렇게 되는가를 보여 줄 때 두 사람은 특히나 닮아 있다. * 주7) 라보프에게 있어 본질적인 것은 '어떤 상수도 동질성도 갖지 않는 규칙들'이라는 관념이다. 성적 변태의 문제를 천착한 대저 [성정신병리]를 저술한 [독일, 오스트리아의 정신병리학자] 크라프트-에빙의 사례는 최근 수행된 푸코의 연구와 매우 유사하다. 크라프트-에빙은 자신의 언표 대상이 지나치게 노골적인 것으로 생각될 경우, 독일어 문장을 라틴어로 분절해 버렸다. 이중적 의미에서 하나의 체계로부터 또 다른 체계에로의 부단한 이행이 존재한다. 우리는 이에 대해 그것이 (수치심 또는 자기 검열 등과 같은) 상황적 또는 외적 변이들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문장의 입장에서 보면 옳은 말이다. 그러나 언표의 관점에서 보면, 크라프트-에빙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언표들은 자신에 고유한 내재적 변이들로부터 분리 불가능한 것이다. 모든 언표가 이런 경우에 속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 심지어 동일한 언어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조차 담론 형성작용의 언표들은 기술로부터 관찰, 계산, 제도, 규정으로 잇달아 이동하면서 그만큼의 체계와 언어들을 섭렵한다. 언표들의 그룹 또는 가족을 "형성하는" 것은 그러므로 동일한 층위 안에서의 이행 및 변양작용의 규칙들이며, 이에 이 규칙들은 언표들의 "가족" 자체를 동질성에 반하는 이질성 또는 분산의 환경으로 간주한다. 연결된 또는 인접한 공간이란 바로 이를 지칭한다. 각각의 언표는 이행의 규칙들(벡터들)에 의해 스스로가 연결되어 있는 이질적 언표들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그리고 이때 각각의 언표들은 "드문"것인 동시에 규칙적인 하나의 다수성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으며, 각각의 언표들 자체 또한 하나의 다수성이 된다. 그것은 단지 다수성일 뿐, 결코 어떤 구조 또는 체계가 아니다. 언표의 위상학은 문장의 변증법과 명제의 유형학을 모두 거부한다. 푸코를 따라, 우리도 하나의 언표, 하나의 언표 가족, 또는 하나의 담론 형성작용이란 무엇보다도 고유한 변양작용의 선들 또는 연결되어 있는 공간 안에서 분산되는 벡터의 장에 의해 결정되는 것임을 믿는다. 이것이 원초적 기능(fonction primitive)으로서의 언표 또는 "규칙성"의 첫째 의미이다.
공간의 두 번째 부분은 상관적 공간인데, 이는 앞서의 연결된 공간과는 구분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전과 같은 언표들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언표가 자신의 주체, 대상, 개념과 맺는 관계이다. 우리는 여기서 언표와 단어, 문장, 명제 사이의 차이를 새롭게 발견한다. 실제로 문장들은 담론이 시작되게 만드는 힘을 소유한 듯이 보이는 언표작용(enonciation)의 이른바 주체에게로 귀착된다. 중요한 것은, 심지어 그것이 명확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조차, 결코 '그'에로 환원될 수 없는 언어학적 인칭으로서의 '나', 연동자 또는 자기 지시적인 것으로서의 "나"이다. 문장은 따라서 내재적 상수('나'라는 형식)와 외재적 변수('나'라고 말하면서 그 형식을 완성하는 사람)라는 이중적 관점에서 분석된다. 언표의 경우, 상황은 전적으로 다르다. 언표는 어떤 하나의 고유한 형식에로 귀착되지 않는다. 언표는 자신의 일부를 이루는 극히 가변적이고도 다양한 내재적 위치들에로 귀착된다. 예를 들어 만약 어떤 "문학적"언표가 그것을 쓴 사람에게로 귀착한다면, 그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에서이기는 하지만, 이름을 스지 않은 편지 역시 그것을 쓴 이에게 귀착하며, 마찬가지로 보통의 편지는 서명인에게, 계약서는 보증인에게, 게시물은 작성인에게, 전집은 편집인에게 귀착된다. ...그리하여 이 모든 것들은 문장이 아닌 언표의 일부를 이루게 된다. 이것이 바로 원초적인 것, 곧 언표로부터 파생된 기능이다. 언표와 가변적 주체와의 관계는 그 자체로 언표에 내재하는 하나의 변이가 된다. "오랫동안 나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 문장은 동일자이나, 언표는 동일자가 아니다. 이 언표는 우리가 그 문장을 어떤 불특정의 주체에 연관시키는가, 또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시작했으며 이를 한 화자에게 부여했던 작가 프루스트에게 연관시키는가에 따라 변화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방식을 거쳐 하나의 동일한 언표가 여러 개의 다른 위치들, 여러 개의 다른 주체들을 갖게 된다. 마치 세비녜 부인이 보낸 어떤 편지의 경우(이 두 경우, 수신인은 동일하지 않다), 또는 간접 화법의 경우처럼(특히 주체의 두 위치들이 상호 침투하는 자유 간접 화법에서처럼), 하나의 저자와 하나의 화자, 또는 하나의 서명인과 하나의 저자가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위치들이 그로부터 언표가 파생되는 어떤 시원적 '나'(un Je primordial)의 형상들인 것은 아니다. 반대로, 이 위치들은 언표 자체로부터 파생되는 것이며, 결국 각각의 언표 가족들에 따라 매번 특화되는 하나의 "비인칭"(non-personne), "그" 또는 "사람들", "그가 말한다", "사람들이 말한다" 등등의 여러 양식이 된다. 푸코는 여기서 모든 언어학적 인칭 체계를 공격하면서 주체의 위치를 익명적 중얼거림(murmure anonyme)의 심연 속에 자리매김했던 블랑쇼와 다시 만난다. 푸코가 자리 잡고자 하는 곳은 바로 이 시작도 끝도 없는 중얼거림이며, 그곳에서 언표들은 그에게 하나의 위치를 지정해 준다. 아마도 이를 우리는 푸코의 가장 감성적인 언표들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를 언표의 대상과 개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말할 수 있다. 하나의 명제는 하나의 지시 대상을 갖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 뜻은 이러하다. 지시 대상 또는 지향성이란 명제의 내재적 상수인 반면, 명제를 충족시키는 사물의 상태은 외재적 변수이다. 그러나 언표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언표는 결코 어떤 겨냥된 사물의 상태 안에서 구성되는 것이 아니며, 반대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파생되는 하나의 "담론적 대상"을 갖는다. 하나의 파생적 대상은 정확히, 마치 원초적 기능의 경우와 같이, 언표적 변양작용의 한계선 위에서 자신을 정의한다. 또한 그것은 지향성의 수많은 유형들을 분류하여, 어떤 것들은 사물의 상태에 의하여 충족될 수 있고, 또 다른 것들은 비어 있는 채로 남아 있다고, 또는 ('나는 일각수와 만났다'처럼) 일반적으로 허구적이거나 상상적이라든가, 심지어 ('사각의 원'처럼) 일반적으로 부조리한 것이라는 식으로 구분하려 들지 ㅇ낳는다. 사르트르는 각각의 꿈과 그 꿈의 이미지는, 지속적인 최면 상태 또는 깨어 있는 일상의 세계와는 달리, 자신만의 특별한 세계를 갖는다고 말했다. 푸코의 언표는 마치 꿈과 같다. 각각의 것들은 자신만의 고유한 대상을 갖는다. 또는 그것은 하나의 세계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따라서 "황금산은 캘리포니아에 있다"는 엄연한 하나의 언표이다. 그것은 지시 대상을 갖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허용되는 공허한 지향성(허구 일반)과는 무관하다. "황금산은..."이라는 이 언표는 분명히 하나의 담론적 대상, 즉 "이와 같은 지리학적 또는 지질학적 환상을 허용하거나 또는 허용하지 않는" 한정된 상상의 세계를 갖는다. 한편 "리츠 호텔만큼 큰 다이아몬드" 같은 예를 생각해 본다면, 이는 더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이 언표는 허구 일반으로 귀착되지 않으며, 오히려 작가의 다른 언표들과 연관되어 하나의 "가족"을 이루면서 하나의 특정 언표를 둘러싸는, 피츠제럴드의 그것과도 같은 아주 특별한 세계에로 귀착된다. 결국 동일한 결론이 개념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분명 하나의 단어는 외재적 변수로서의 시니피에처럼 하나의 개념을 갖게 된다. 동시에 단어는 (내재적 상수인)자신의 시니피앙들(signifiants)에 의해 그 자신에 연결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언표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 언표는 자신의 개념들 또는 차라리 자신의 고유한 담론적 "도식들"을 갖는다. 언표는 이 도식들에 의해 이질적 체계들의 교차점에서 자신을 원초적 기능으로서 드러낸다. 예를 들면(17세기의 광증이 19세기에 이르러 편집광증으로 변화했던 것처럼...) 특정 시대, 특정 담론 형성의 의학적 언표에서 보이는 징후들을 구분하는 다양한 그룹 및 분류들을 생각해 보라.
만약 언표가 단어, 문장, 명제와 구분된다면, 그것은 언표가 자신 안에 마치 어떤 '파생물들'처럼 주체, 대상, 개념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엄밀히 말해서, 주체, 대상 ,개념이란 다만 원초적인 것, 곧 언표로부터 파생된 기능들에 불과하다. 따라서 상관적 공간이란 하나의 언표 가족 내에서 주체, 대상, 개념이 점유하는 입장들 또는 위치들로 구성되는 담론적 질서이다. 이것이 "규칙성"의 두 번째 의미이다. 이 다양한 위치들은 특이점들을 재현한다. 따라서 내재적 상수와 외재적 변수에 의해 진행되는 단어, 문장, 명제의 체계는 고유한 변이 및 내재적 변수에 의해 진행되는 언표들의 다수성에 대립된다. 이제 단어, 문장, 명제의 관점에서는 하나의 우연으로 간주되던 것이 언표의 관점에서는 규칙이 된다. 푸코는 이렇게 새로운 화용론의 기초를 세운다.
이제 외재적인 공간의 세 번째 영역이 남아 있다. 보충적 공간(l'espace complementaire) 또는 (제도, 정치적 사건, 경제적 실천 및 과정을 포함하는) 비담론적 형성작용들(formations non discursives)이 그것이다. 푸코가 자신의 정치 철학적 개념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이곳에서이다. 하나의 특정 제도는 그 자체로 헌법, 헌장, 계약, 등록, 기입 등과 같은 일련의 언표들을 함축한다. 반대로 언표들은 하나의 특정한 제도적 환경에로 귀착된다. 이 특정 제도적 환경이 없다면, 언표의 이러저런 장소들에서 생겨나는 대상들, 또는 이러저런 위치에서 말하는 주체의 형성이란 불가능할 것이다.(예를 들면, 한 특정 사회에 있어서의 작가가 갖는 지위, 병원 또는 진료소에서 의사가 갖는 지위는 주어진 시대의 새로운 대상을 출현시킨다). 그러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도들의 비담론적 형성작용과 언표들의 담론 형성작용 사이에는 서로서로를 상징화하는 두 표현들 사이에 존재하는 일종의 수직적 평행선(표현이라는 1차적 관계들), 또는 그에 따라 사건과 제도가 언표의 저자로 추정되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결정해 주는 일종의 수평적 인과성(반성이라는 2차적 관계들)을 확립하고자 하는 커다란 유혹이 생겨난다. 이 능선은 언제나 비담론적 환경을 수반하는 담론적 관계들이라는 세 번째 길을 열어 놓는다. 이 담론적 관계들은 그 자체로는 언표 그룹들에 대해 내재적이지도 외재적이지도 않지만 우리가 곧 다루게 될 한계, 즉 그것 없이는 특정 언표 대상들이 나타날 수 없고 또 언표 자체 안에서도 특정 위치들이 설정될 수 없는, 특정의 한정된 지평을 구성한다. "물론 19세기 초 이래로 의학에 조직손상 또는 해부병리학적 상호관계와 같은 새로운 대상들을 부여했던 것이 정치적 실천이라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정치적 실천은 (행정적으로 등록되고 감시되는 인구의 총 수... 인민들로 구성된 대규모 군대... 당시의 경제적 요구 및 사회 계급들 사이의 상호적 입장에 연관되는 구호, 원조 제도들로 구성되는) 의학적 대상들의 위치설정(reperage)과 관련된 새로운 장을 열었다. 우리는 정치적 실천과 의학적 담론의 이런 관계가 의사에게 할당되는 위치의 경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고유성-진부성'의 구분이 적절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되풀이될 수 있는 것은 이제 언표에 속하게 된다. 하나의 문장은 다시 시작되거나 또는 다시 언급될 수 있고, 마찬가지로 하나의 명제 역시 다시 현실화될 수 있지만, "다시 되풀이될 수 있는 고유한 능력을 갖는 것은 오직 언표뿐이다". 그러나 되풀이의 현실적 조건들은 매우 엄격해 보인다. 분산의 공간, 특이성들의 분포, 장소 및 위치 사이의 질서, 특정 제도적 환경과 맺는 관계, 이 모든 것이 언표의 되풀이를 가능케 하는 하나의 "물질성"을 구성한다. "종은 변화한다"라는 언표가 18세기 자연사와 19세기 생물학에서 동일한 의미를 가졌던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언표의 기술은 전적으로 다른 측정 단위, 거리, 배치 및 제도에 따라 매번 상이한 가치를 갖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심지어 다윈에서 심슨에 이르기까지 이 언표가 언제나 동일한 가치를 유지해 왔다는 사실조차 확신할 수 없다. "광인들을 수용소로!"라는 하나의 동일한 슬로건-문장도 그것이 18세기처럼 광인과 죄수를 혼동하는 것에 대한 항의로서 주장되는가, 또는 반대로 19세기처럼 죄수들로부터 광인들을 분리하기 위한 수용소의 요구를 위한 것인가, 또는 오늘날처럼 의료 환경의 변화에 반하여 제기되고 있는가에 따라 완전히 구별되는 상이한 담론형성들에 속할 수 있다. 또 우리들은 푸코가 행했던 것은 맥락에 대한 매우 고전적인 분석의 세련화 작업에 불과하다고 반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푸코가 제시했던 기준의 새로움에 대한 몰이해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푸코가 제시한 기준은 정확히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각각에 상응하는 언표 안에서 동일한 위치의 점유 또는 동일한 특이성들의 재생산 없이도 하나의 문장을 말하거나 하나의 명제를 형성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언표가 속하는 특정 담론형성을 결정해 주는 잘못된 되풀이를 표명하기에 이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런 차별적 형성들 사이에서 동형성 도는 동위성의 현상들을 대신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맥락은 이와 달리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는데, 이는 맥락이 문제가 되는 언표들의 가족 또는 담론 형성에 따라 매번 상이한 성질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만약 언표들의 되풀이가 이와 같이 엄격한 조건들을 갖는다면, 이는 외재적 조건들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되풀이 자체를 언표의 고유한 역능으로 만드는 내재적 물질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하나의 언표가 정의되는 것은 언제나 자신이 속한 동일한 층위 안에 존재하는 어떤 다른 것(un autre chose), 곧 그 자신이 관련되는 어떤 다른 것과의 특정 관계에 의해서이다(언표는 결코 자신의 의미 또는 요소들에 의해 정의되지 않는다). 이 "다른 것"은 때로 그 언표가 공개적으로 되풀이되는 경우 하나의 언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극한에서 그것은 하나의 언표라기보다는 필연적으로 언표 이외의 어떤 것, 곧 하나의 '바깥'(un Dehors)이다. 그것은, 마치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위치들과도 같은, 특이성들의 순수한 방사작용이다. 왜냐하면 이 특이성들은 아직 자신들의 주변에서 이러저런 특정 형식으로 형성되면서 자신들을 결합시켜 주는 언표들의 곡선에 의해 한정되거나 특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푸코가 보여 준 것은 다음과 같은 점이다. 하나의 곡선, 그래프, 피라미드는 언표들이지만, 그것들이 재현하는 것들은 언표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옮겨 쓰는 AZERT라는 일련의 문자들은 하나의 언표이지만, 타자기 자판 위의 동일한 문자들은 언표가 아니다. 우리는 이 경우 하나의 비밀스러운 되풀이가 언표에 생기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리고 독자는 (푸코의)[레몽 루셀]의 가장 아름다운 페이지들 속에서 빛나고 있는 하나의 테마, 즉 "역설적으로 동일성을 유도해 내게 되는 아주 작은 차이"에 관한 테마를 재발견한다. 설령 언표가 되풀이하는 것이 "언표와 이상하리만큼 닮아 있는 거의 동일한 것"이라 부를 수 있는 "다른 것"이라 해도, 언표는 그 자체로 되풀이이다. 그러므로 푸코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언표가 전제하는 이 특이성들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를 아는 일이었다. 그러나 [지식의 고고학]은 이 지점에서 중단되며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런 문제를 더 이상 다루지 않는다. 푸코의 독자들은 하나의 새로운 영역, 즉 권력과 지식이 결합되는 곳에 이르러서야 그 의미를 간파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푸코가 이 문제를 탐구하는 것은 이후의 책들을 통해서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자판 위의 AZERT가 권력 초점들의 총체이며 손가락의 사용 편차와 빈도에 따라 불어 알파벳 문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힘-관계들(rapports de forces)의 총체라는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 -<푸코>, 질 들뢰즈, p.19-30
푸코는 [말과 사물]에서 중요한 것은 사물도 말도 아니라고 설명한다. 이 점은 대상 또는 주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문장 또는 명제, 문법적/논리적/의미론적 분석 역시 마찬가지이다. 언표는 말과 사물의 종합, 또는 문장과 명제의 혼합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반대로 언표는 자신을 암묵적으로 전제하는 문장 도는 명제에 선행하면서 단어와 대상을 형성시키는 것이다. 푸코는 두 번에 걸쳐서 자신의 후회를 고백했다. 푸코는 우선[광기의 역사]에서 여전히 야생적 사물의 상태 및 명제들 사이의 이원성으로서 각인되어 있었던 광기의 "[벌거벗은] 체험"에 지나치게 의존했다. 다음으로 푸코는 [임상의학의 탄생]에서 대상영역과의 관계에 고착되어 있는 주체의 통일적 형식을 상정하는 "의학적 시선"에 지나치게 의존했다. 그러나 아마도 이런 후회는 맴번 겉으로만 그랬던 것 같다. 푸코가 하나의 새로운 실증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광기의 역사]가 갖는 아름다움의 일부를 구성ㅇ하고 있었던 낭만주의를 포기했던 것을 후회할 필요는 없었다. 그 자체로 시적인 이 희소화된 실증주의는, 담론 형성작용 및 언표의 산종작용(dissemination) 속에서, 늘 광기의 경험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일반적 체험, 또한- 어떤 '세계관'과도 무관하게 -늘 모든 문명화된 의사, 임상의, 진단의, 징후학자가 갖게 마련인 하나의 유동적 지위를 다시금 활성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혁명적 실천과 융합되는 생산의 일반 이론에 의존하지 않으려는 [지식의 고고학]이 도달한 결론은 무엇이었을까? 나의 생명과 죽음에 무관하게 "바깥"이라는 요소 안에서 작동하는 담론이 형성되는 곳은 어디일까? 왜냐하면 담론 형성작용은 참다운 실천이며, 또한 그것의 언어는 어떤 보편적 로고스가 아니라 돌연변이를 촉진하고 표현하는 '사멸하는 언어작용들'(languages mortels)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표들의 그룹 또는 하나의 언표란 결국 다수성들이다. 물리학 및 제반 수학들에 연관하여 "다수성" 및 다수성들의 유형이라는 개념을 형식화한 것은 리만이다. 이 개념에 철학적 중요성이 부여된 것은 후설의 [형식 논리와 선험 논리] 그리고 베르그손의 [의식의 직접적 소여에 관한 시론] 이후의 일이다. 리만이 이산적(discretes)다수성과 연속적(continues) 다수성을 구분하려 한 것과 유사하게, 베르그손은 지속을 공간적 다수성에 반하는 또 다른 유형의 다수성으로 정의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 두 방향 모두에서 다수성의 관념은 이후 사라져 버렸다. 왜냐하면 이런 구분은 다수성의 관념을 너무 단순한 이원론 안으로 은폐하거나 또는 그런 구분 자체가 공리적 체계의 지위를 지향하곤 했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다수성의 관념에 본질적인 것은 다음과 같은 점이다. "다수"(multiple)와 같은 어떤 실사적인(substantif)무엇이 구성되면, 그것은 '일자'에 대립될 수 있거나, 또는 하나로 지칭되는 특정 주체에 귀속될 수 있는 술어이기를 그친다. 다수성은 전통적인 일자와 다자의 문제(problemes du multiple et de l'un), 특히 다수성을 조건 짓고 사유하면서 하나의 기원으로부터 다수성을 이끌어 내는 것으로 가정되었던 주체의 문제와는 전혀 무관하다. 일자 안에서 재생되고 또 타자 안에서 전개되는 것으로 가정되면서 여하한 방식으로든 하나의 의식으로 되돌아가는 일자 또는 다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것은 오직 특이점들을 갖는 희소한 다수성들, 특정 순간에 주체들로서 기능하기 위해 비어 있는 위치들, 그리고 누적과 되풀이가 가능하고 그 자체로 보존되는 규칙성들뿐이다. 다수성은 공리적이거나 유형학적인 것이 아니며, 오직 위상학적인 것이다. 푸코의 [지식의 고고학]은 다수성들의 이론-실천에 관련된 결정적인 한 걸음을 보여 준다. 블랑쇼는 문학생산의 논리라는 영역에서 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동일한 길을 보여 준 바 있다. 블랑쇼는 '하나의 의식 또는 주체의 형식'과 '무차별적이고 무한한 하나의 심연'을 동시에 거부함으로써, 특이한 것(le singulier)과 복수적인 것(le pluriel), 중립적인 것(le neutre)과 되풀이 (la repetition) 사이에 엄밀한 연관성을 부여한다. 푸코는 블랑쇼와의 이런 친근성을 숨기지 않았다. 또한 푸코는 오늘날의 논쟁에서 본질적인 것은 사람들이 구조라 부르는 모델 또는 실재의 실존 여부에 관한 구조주의적 측면이 아니며, 오히려 전적으로 구조화 가능한 것으로는 믿어지지 않았던 다양한 차원들 안에서 주체에로 되돌아가는 위치와 지위에 관련된 것임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구조와 역사를 직접적으로 대립시키는 한, 사람들은 주체가 구성, 집약, 통일하는 행위자로서의 일정한 의미를 지켜낼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그러나 사람들이 "시대" 또는 역사적 형성을 다수성으로 간주한다면, 문제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이 경우 다수성은 주체의 지배와 구조의 제국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구조는 명제적인 동시에 이미 결정되어 있는 특정 층위에 한정되는 공리적 성격을 갖는다. 구조가 동질적 체계를 형성하는 것인 데 반해, 언표는 다양한 층위들을 가로지르며 "가능적인 단위들 및 구조들의 영역과 교차하면서 그것들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구체적 내용들을 통해 드러나도록 만드는" 특정 다수성이다. 주체는 문장적인 것 또는 변증법적인 것이다. 주체는 담론을 시작하는 1인칭의 성격을 갖는 반면, 언표는 주체를 3인칭의 파생적 기능으로서만 존속시키는 하나의 익명적인 원초적 기능(fonction primitive anonyme)이다. 고고학은 이제까지 "문서고학자들"에 의해 채용되어 왔던 두 가지 주요한 원칙적 기술들인 형식화(formalisation) 및 해석(interpretation)에 반대한다. 문서고학자들은 종종 이 두 기술에 동시에 의존함으로써 두 기술 중 하나로부터 다른 하나로 비약하기도 했다. 또는 때때로 그들은 문장으로부터 마치 그 문장의 명확한 의미처럼 기능하는 하나의 논리적 명제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그들은 이제 "등록되어" 있는 것을 넘어 하나의 이해 가능한 형식에로 향한다. 이때의 이해 가능한 형식이란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의 상징적 표면 위에 등록 가능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등록(inscription)의 질서와는 다른 또 하나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다. 또는 때로 그들은 이와는 반대로 문장을 넘어 또 다른 하나의 문장을 향하기도 하는데 이를 통해 전자는 후자에로 은밀히 귀착하게 된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또 하나의 등록에 의해 이미 등록된 것을 이중화한다. 이 또 하나의 등록은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의 숨겨진 의미를 구성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동일한 사물을 등록하거나 혹은 동일한 내용을 갖는 것은 아니다. 이런 두 가지 극단적 태도는 해석과 형식화가 진동하고 있는 두 극점을 나타낸다(예를 들면, 우리는 이런 현상을 형식적-기능적 가설과 "이중 등록"의 위상학적 가설 사이에서 망설이는 정신분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로부터 하나의 동일한 문장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두 개 이상의 명제를 구분해야 함을 보이려는 논리학적 경향, 그리고 하나의 문장은 앞으로 채워져야 할 일련의 틈새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보이려는 해석에 연관되는 제 학문의 경향이 생겨난다. 따라서 실제로 말하여진 것 또는 말하여진 것의 단순한 등록에 만족한다는 것은 방법론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로 보인다. 언어학조차도 여기에 만족하지 않는데, 특히 언어학의 단위들이 결코 말하여진 것과 동일한 층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푸코는 이와는 전혀 다른 기획을 옹호했다. 진술이 갖는 실증성으로 간주되는 말하여진 것에 대한 이 단순한 등록이 도착한 최종 지점은 물론 언표이다. 고고학은 "언어적 수행의 뒤쪽 또는 바깥쪽 표면 아래 존재하면서 그것들 안에 묻혀 있거나 또는 횡단하며 침묵 속에 드러나 있는 숨겨진 요소 또는 은밀한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그것들을 우회하려 하지 않는다. 물론 언표가 직접적으로 가시적인 것은 아니다. 언표는 문법적 또는 논리적 구조처럼 명확히 드러나 있는 것은 아니다(설령 그런 구조 역시 완전히 명확하기만 한 것은 아니고, 이를 해명하는 일 또한 매우 어려운 일이라 해도 말이다). 언표는 가시적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은폐된 것도 아니다.(L'enonce est a la fois non visible et non cache)".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몇몇 부분들에서 푸코는 모든 언표는 실제로 말해진 것에 관련되기 때문에 어떠한 언표도 잠재적 존재가 아님을 보여 준다. 그곳에서 나타나는 결여와 공백조차도 숨겨진 의미작용과 혼동되어서는 안된다. 그것들은 단지 "가족"을 구성하는 분산작용의 공간 안에서 자신의 현존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역으로 만약 말해진 것과 동일한 층위에 속하는 이런 등록에 도달하는 것이 그렇게도 어렵다면, 그것은 언표가 즉각적으로 지각 가능한 것이 아니며 언제나 문장과 명제들에 의해 은폐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사실로부터 "초석"을 발견하고 다듬어야 하고, 때로 심지어는 형성하고 창조해 내야만 한다. 우리는 이 초석의 3중적 공간을 발명하는 동시에 그것을 절단해 내야만 한다. 또한 말하여진 것에 대한 단순한 등록으로서의 언표가 나타날 수 있는 것도 오직 이렇게 구성되는 다수성 안에서이다. 오직 그런 연후에야 해석과 형식화는 이런 단순한 등록을 자신들의 선행 조건으로서 전제하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일정한 조건들 아래에서 또 다른 하나의 등록 안으로 이중화되는 또는 하나의 명제 안으로 투영되는 모든 것은 실상 이미 언표의 등록(등록으로서의 언표)이 아닐까? 모든 기명(suscription) 및 서명(souscription)은 자신의 담론형성 안에서 언표의 독특한 등록으로 귀착된다. 이들은 오직 문서고의 기념비일 뿐, 결코 자료가 아니다(monument d'archive, non document). "설령 언어작용이 대상으로 간주되고 구분 가능한 층위들 안에서 분해, 기술, 분서 될 수 있다 해도, 그것에는 언제나 결정되어 있으며 무한하지 않은 하나의 '언표적 소여'(donne enonciatif)가 존재해야만 한다. 언어작용의 분석은 언제나 파롤과 텍스트라는 특정 코르퓌스 위에서 이루어진다. 암묵적인 의미작용들을 해석하고 그것들을 햇빛 아래 드러내는 일은 언제나 특정 문장들로 이루어진 한정된 집합에 준하여 이루어진다. 체계에 대한 논리적 분석은 그것이 다시-쓰기(reecriture)이든 또는 어떤 형식적 언어에서이든 상관없이 늘 주어진 명제들의 특정 집합을 함축한다.
이것이 바로 구체적 방법론의 본질이다. 우리는 단어와 문장과 명제로부터 출발하기를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단지 제기된 문제에 따라 변화하는 특정 코르퓌스 안에서만 이들을 조직할 수 있을 뿐이다. 이것이 블룸필드와 해리스가 주도했던 "분포주의"(distributionaliste)학파의 요구였다. 그러나 푸코의 독창성은 코르퓌스를 한정하는 자신만의 방법론에 있다. 그것은 언어학적 빈도 또는 상수와 무관한 것이며, 또한 (위대한 사상가, 저명한 정치인 등) 말하고 쓰는 이들의 개인적 자질과도 무관하다. 에발드가 푸코의 코르퓌스는 "지시 대상 없는 담론들"이며, 이 문서고학자가 가능한 한 대가들의 이름을 인용하지 않으려 했다고 말했던 것은 옳은 일이었다. 문서고학자는 자신의 기초적 단어나 문장 또는 명제의 선택에 있어 결코 그것들을 생산한 어떤 저자-주체 또는 구조라는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 그는 오히려 그것들이 하나의 전체로서 기능하는 특정의 단순 기능에 따라 그것을 선택한다. 수용소 또는 감옥의 감금에 관련된 규칙들, 군대와 학교에 있어서의 훈육 규칙들이 그 예이다. 물론 우리가 이에 사용되는 푸코의 기준들에 의문을 제기한다 해도, 우리가 이에 대한 답변을 듣게 되는 것은 [지식의 고고학] 이후의 일이다. 특정 코르퓌스 안에 나타난 단어, 문장 및 명제는 이러저런 문제들과의 관계 안에서만 기능하는 권력(과 저항)이라는 분산된 초점의 주변에서 선택되어야만 한다. 예를 들어, 19세기의 "섹슈얼리티"라는 코르퓌스의 경우를 살펴보자. 우리는 고해실 주변에서 교환되는 단어들과 문장들 그리고 교리 지침서 안에서 생성되는 명제들을 찾게 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출산 및 결혼에 관계되는 각종 제도 및 학교 등과 같은 여타의 요소들을 고려에 넣어야만 할 것이다... . 결국, 이론 자체는 보다 이후에 나타나게 되지만, 이런 기준은 이미 [지식의 고고학]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 그리하여 (언표에 대해 결코 어떤 것도 미리 전제하지 않는) 코르퓌스가 일단 한 번 구성되고 나면 이제 우리는 언어가 이 코르퓌스 위로 집결하고 그 위로 "떨어지는" 방식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이 바로 [말과 사물]이 말했던 "언어작용의 존재"이고, [지식의 고고학]이 제시했던 "언어작용이 있다"이다. 그리고 이는 매번의 전체적 상황에 따라 항시적으로 변화한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말한다"이며, 또한 주어진 코르퓌스에 따라 각기 다른 억양을 갖게 되는 익명적 중얼거림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단어, 문장, 명제와는 혼동될 수 없는 언표를 식별해 낼 수 있다. 언표는 단어, 문장 또는 명제가 아니며, 오직 그것들의 코르퓌스로부터만 명료히 드러나게 되는 특정의 형성작용들이다. 한편 이때 문장의 주체, 명제의 대상, 단어의 시니피에는 "사람들이 말한다"는 것 안에서 특정의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또한 그것들을 언어의 농밀함 속에서 스스로 분산, 분포되면서 본성 자체가 변화한다. 푸코에게 상존하는 이런 하나의 역설을 따라, 언어작용은 오직 언표들의 분포와 분산이라는 중심 즉 자연스럽게 분산되는 하나의 "가족"이라는 규칙을 향하는 하나의 코르퓌스 위로 집결하게 된다. 이런 방법론은 푸코의 모든 저작들 구석구석에서 실로 엄격하게 수행되고 있다.
고골은 죽은 넋들을 다룬 자신의 걸작을 쓰면서 설명하기를, 자신의 소설은 시이며, 또한 소설이 어떤 지점에서 어떻게 필연적으로 시가 되어야만 하는가를 보여 주었다. 아마도 푸코 역시 이런 고고학을 통해, 자신의 방법론적 담론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이전 작품에 대한 시를 쓰고 있는지도 모른다. 또한 그는 이런 작업을 통해 철학이 필연적으로 시(말하여진 것의 시, 또한 가장 심오한 의미와 무의미의 의미를 함깨 갖는 강력한 시)가 되어야만 하는 어떤 지점에 도달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런 의미에서, 푸코는 자신이 오직 허구만을 써왔다고 선언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언표는 꿈과 닮아 있고, 모든 것은 마치 만화경에서처럼 우리가 좇고 있는 느으선과 주어지는 코르퓌스에 따르 늘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 다른 어떤 의미에서, 푸코는 자신이 오직 실재적인 것만을 다루었고 또한 그런 것만을 써 왔다고 말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언표 안에서 모든 것은 실재적이고, 모든 실재는 오직 언표 안에서만 드러나기 때문이다.
실로 수많은 다수성들이 있다. 담론적 다수성과 비담론적 다수성이라는 거대한 이원론뿐만 아니라, 담론적 요소들 사이에도 각각의 시대를 다르는 무한히 다양한 수의 언표 가족들 또는 형성들이 존재한다. 특정 "문턱들"에 의해 구분되는 언표들의 다양한 종류들 역시 존재한다. 하나의 동일한 언표 가족이 수많은 언표의 종류들을 가로지를 수도 있으며, 마찬가지로 동일한 하나의 언표 종류가 수많은 언표 가족들을 나타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과학은 "인식론화"(epistemologisation), "과학성"(scientificite) 또는 심지어는 "형식화"(formalisation)를 획득한 언표들의 저 너머에 존재하는 몇몇 문턱들을 함축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은 결코 자신을 구성시키는 언표 가족 또는 형성을 완전히 포괄할 수 없다. 정신의학의 과학으로서의 지위 또는 주장이 그에 대응하는 담론 형성작용의 구성적 부분을 이루는 갖가지 법률 텍스트, 문학적 표현물, 철학적 고찰, 정치적 결정 또는 여론 등등을 철폐시켜 버리지는 못한다. 과학은 다만 언표의 형성을 지향하고 그 영역들 중 몇몇을 체계화 또는 형식화할 뿐이다. 또 과학은 역으로 하나의 단순한 과학적 불완전성이라는 신념으로 한정될 수만은 없는 하나의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필연적으로 예비한다. 간단히 말해 과학은 자신이 완전히 포괄할 수 없는 특정 지식영역, 또는 그 자체가 (과학의 대상이 아니라) 지식의 대상인 특정 형성작용 안에서 구체화되는 어떤 것이다. 지식은 과학이 아니며, 심지어는 인식도 아니다(Le savoir n'est pas science ni meme connaissance). 지식은 이미 정의된 다수성들을 대상으로 한다. 또는 지식은 심지어는 자신의 특이점, 위치, 기능에 의해 기술되는 바로 그 엄밀한 다수성 자신을 대상으로 삼기도 한다. "담론실천은 자신이 탄생시키는 과학적 세련화 작업과 일치하지 않는다. 담론실천이 형성하는 지식 또한 어떤 구성적 과학의 일상적 부산물 또는 거친 미완성품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몇몇 다수성 및 형성들이 이들을 인식론적 문턱으로 이끄는 지식을 지향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것들은 다른 방향, 또는 전혀 다른 문턱을 지향한다. 이는 단순히 언표 가족들 중 몇몇이 만약 최소한 재배치 또는 실제적인 변이에 의하지 않는다면 과학으로서의 "자격을 결여하고"있다는 뜻이 아니다(17세기와 18세기에 존재했던 정신의학의 선행적 형태들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묻는 것은 오히려 과학과는 다른 어떤 방향으로 지식을 추동하면서 동시에 하나의 문학적 텍스트 또는 하나의 회화적 작품을 자신이 속해 있는 담론적 실천으로 한정 짓는 어떤 문턱들(예를 들면, 심미적 문턱들)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또한 심지어는 윤리적인 또는 정치적인 문턱들까지도 존재할 수 있다. 우리는 금지, 배제, 자유, 위반 등이 어떻게 비담론적 주변부와의 연관 하에 "이미 결정된 특정의 담론실천에 결합되어" 있는가를 밝혀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건, 제도 및 다른 모든 실천들과의 연관 하에 고고학-시(poeme-archeologie)는 모든 종류의 다수성들에 대한 기록들(registres)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말해진 것의 고유한 등록들(inscription)에 의해서도 스스로를 형성하게 된다. 여기서 본질적인 것은 결코 우리가 바슐라르의 저작을 철저하게 관통하고 있는 시-과학의 이중성(dualite science-poesie)을 극복했다거나, 또는 우리가 문학적 텍스트들을 과학적으로 다루는 방법을 발견했다는 등의 주장이 아니다. 본질적인 것은 어떤 문학적 형식, 과학적 명제, 일상적인 문장, 정신분열적 무의미 등등의 개별 언표들이 그것들을 담론적 동등성에로 이끌어 주는 어떤 환원 또는 공통의 척도 없이도 모두 동등한 하나의 언표들로서 존재하는 미지의 땅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측량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는 이전의 어떤 논리학자, 형식주의자, 또는 해석학자에 의해서도 답파된 적이 없었던 새로운 영토이다. 과학과 시는 모두 지식이다.
그렇다면 하나의 담론 형성작용 또는 가족은 어떻게 정의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단절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이는 문턱에 대한 질문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질문이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어떤 공리적, 또는 엄밀히 말하면 구조적 방법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타당한 방법일 수 없다. 왜냐하면 가장 일반적이며 형식화하기 쉬운 언표의 수준에서조차 특정 형식의 다른 형식으로의 대체가 항상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직 오늘날의 역사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계열적(serielle) 방법만이 특정의 특이점 주변에 계열을 구성하고 또 그 계열을 각기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 여러 다른 지점들에로 확장시켜 주는 또 다른 계열을 추적할 수 있게 해 준다. 언제나 계열들이 새로운 공간 안에서 분산되고 분포되는 하나의 순간 또는 일련의 장소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단절은 바로 이곳에서 일어난다. 이는 특이성들과 곡선들 위에 정초된 계열적 방법이다. 푸코는 이 방법이 역사가들에게는 아주 광범위한 장기지속에 대한 단절들을 행하도록 이끄는 반면, 인식론주의자들에게는 종종 아주 단기적인 지속에 대한 단절들을 다수화하도록 이끌기 때문에 상반된 두 가지 효과를 갖는 듯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뒤에서 다시 다루게 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면에서 본질적인 것은 이런 계열의 구성이 결정 가능한 특정의 다수성 안에서 일단 한 번 성립되고 나면, 이후로는 철학자들이 상상해 왔던 바와 같은 어떤 '주체'의 연속적 역사가 전혀 불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이다("역사적 분석으로부터 연속적 담론을 이끌어 내는 것, 인간의 의식으로부터 모든 생성과 실천의 시원적인 주체를 이끌어 내는 것, 이는 하나의 동일한 사유 체계가 갖는 두 측면이다. 이때의 시간이란 오직 총체화의 개념 아래에서만 이해 가능한 것이며, 혁명 또한 단지 의식의 포착으로서만 이해 가능하다. ...").
언제나 '역사'에 의존하면서 이를테면 "변이"와 같은 개념의 불확정성에 저항해 왔던 사람들은(수많은 요인들에 의해 다른 장소, 다른 시대에서 나타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바로 그 시대 그곳에서만 자본주의가 탄생했는가를 설명해야만 하는 진정한 역사가들의 당혹감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계열들을 문제화하라... ." 담론적이든 아니든, 모든 형성, 가족, 다수성은 역사적이다. 이들은 "파생물들의 시간적 벡터들"과 분리 불가능하다(단순히 공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규칙, 계열과 함꼐 하나의 새로운 특정 형성작용이 나타났을 때, 그것은 결코 단번에 생겨난 하나의 문장 또는 하나의 창조라는 형식을 갖지 않는다. 그것은 오직 새로운 규칙들 아래에서도 살아남은 옛 요소들의 재활성화(reactivations), 변위(decalages), 잔존물(survivances)이라는 특성을 갖는 "벽돌"의 형식을 갖는다. 이때, 그것들 사이의 동형성 및 동위성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성도 다른 한 형성의 모델이 되지 않는다. 단절의 이론은 따라서 체계의 본질적 부분이다. 우리는 계열들을 추적하고 층위들을 횡단하며 문턱들을 뛰어넘어야 한다. 우리는 결코 현상들과 언표들을 수평적 또는 수직적 차원에 입각해 전개시키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되며, 오직 고고학자-문서고학자가 그것을 다라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유동적 능선 또는 횡단선을 형성해 내야 한다. 베베른의 '희소화된 우주'에 대해 불레즈가 내렸던 판단은 푸코(와 그의 스타일)에 대해서도 옳은 말이다. "그는 우리가 능선적이라 부를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을 창조했다. 그 능선적 차원은 단순한 기획이 아닌 실제의 공간에서 점, 블록, 형상의 재배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p.30-45
1. 소유의 요청(postulat de la propriete). 권력은 특정 계급에 의해 획득 가능한 것이며, 따라서 "소유물"이다. 그러나 푸코는 권력이 소유물이 아니며,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 역시 그렇지 않음을 보여 주었다. 권력은 하나의 소유물이라기보다는 차라리 하나의 전략이다. 또한 권력의 효과는 어떤 점유에 귀속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다양한 배치, 조작, 전술, 기술, 기능에 속하는 것이다". "권력은 소유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행사되는 것이다. 권력은 지배 계급에 의해 획득 또는 유지될 수 있는 어떤 특권이 아니며, 오히려 다양한 전략적 위치들이 빚어내는 전체적 효과다." 이 새로운 기능주의(fonctionalisme) 또는 기능적 분석(analyse fonctionnelle)이 계급의 존재, 또는 계급들 사이의 투쟁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 새로운 분석은 다만 우리들에게 익숙한 전통적 역사 또는 심지어 마르크스주의의 역사와도 전혀 다른 배경, 인물, 절차를 거쳐 계급과 투쟁에 관한 또 하나의 전혀 다른 그림을 우리들에게 보여 줄 뿐이다. 서로 간에 어떤 유사성, 동형성 또는 일의성도 갖지 않으며 오직 가능적 연속성이라는 고유한 유형만을 갖는 "무수한 대립점들, 불확정적인 초점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 각각은 갈등, 투쟁, 그리고 최소한 힘관계의 일시적 역전이라는 위험을 수반한다". 간단히 말해, 권력은 동질성을 갖지 않으며 오직 자신이 지나는 특이점, 특이성들에 의해 정의될 뿐이다.
2. 국지화의 요청, 권력이란 오직 국가 권력이며, 단일한 국가기구 안에 그 자체로 국지화되어 있다. 따라서 이런 관점에 따르면 심지어 "사적" 권력들조차 단순히 외적으로만 분산되어 있을 뿐 사실상은 국가의 특별한 기구들에 불과하다. 푸코는 반대로 국가 자체가 전혀 다른 차원에 위치하면서 스스로 "권력의 미시물리학"(microphysique du pouvoir)을 구성하는 무수한 톱니바퀴들, 초점들에 의해 파생되는 특정한 전반적 효과, 특정한 다수성의 결과물로서 나타나는 것임을 보여 주었다. 사적 체계들만이 아니라, 국가기구의 명백한 구성 부분들 역시 동시에 하나의 기원, 곧 특정 절차들 및 실천들을 갖는다. 국가는 다만 이런 절차와 실천을 승인, 통제, 또는 때로 심지어 포괄하는 것에 만족할 뿐, 결코 제도화하지는 못한다. [감시와 처벌]의 핵심적 관념들 중 하나는 근대 사회가 "규율적" 사회로서 정의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규율이 어떤 하나의 제도 또는 기구와 동일시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정확히 규율이 모든 종류의 기구들과 제도들을 가로지르면서 이들을 또 하나의 새로운 양식으로 재접합, 연장하고, 나아가 집중, 실행시키는 하나의 권력 유형, 즉 하나의 테크놀로지이기 때문이다. 내치(police) 또는 감옥과 같이 명백히 국가에 속하는 특별한 요소들 도는 톱니바퀴들에 대해서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만약 제도로서의 내치가 국가기구라는 형식 아래 잘 구성되어 있고 또 그것이 정치적 지배의 중심부에 확고히 연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내치가 행사하는 권력의 유형, 내치가 작동되는 메커니즘, 또 내치가 적용되는 요소들은 모두 특수한 것들이다." 또한 그것은 특정한 사회적 장 안에 존재하는 무수하고도 유연한 세부들에 이르기까지 규율을 침투시키는 임무를 수행하며, 이로써 자신이 사법적 또는 심지어는 정치적 기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더욱 강력한 이유에 의해, 감옥은 결코 "한 사회의 사법적, 정치적 구조들"에 자신의 기원을 두지 않는다. 감옥이 법(이 경우에는 형법)의 진화에 의존해 형성된다는 관념은 오류이다. 형벌의 통제라는 점에서 감옥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요청되는 일종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심지어 국가기구에 봉사할 경우에조차도 국가기구를 넘어서는 "규율적 보충물"임을 증거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 푸코의 기능주의는 권력의 근원으로 인정되는 어떤 특권적 영역을 더 이상 승인하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한 국지화도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근대적 위상학에 상응한다(이에는 마치 아ㅠ서 논의했던 현대의 수학적 또는 물리적 공간과 유사한 사회적 공간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존재한다). 위른 이 "국지적"이라는 용어가 전혀 다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유념해야만 한다. 권력은 국지적이다. 왜냐하면 권력은 결코 일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권력은 국지적이지 ㅇ낳으며 또한 국지화 가능한 것도 아닌데, 이는 권력이 분산적 특성을 갖기 때문이다.
3. 종속의 요청. 국가기구 안에서 구체화되는 권력은 하부 구조로 간주되는 특정 생산 양식에 종속되어야 한다. 또한 모든 거대 형벌 제도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각기 자신에 상응하는 생산 체계들을 갖는다. 규율메커니즘은 특히 이윤을 증가시키고 다양한 힘들을 새롭게 구성했으며 신체로부터 가능한 한 최대의 유용한 힘을 이끌어 내고자 했던 18세기의 생산증대 및 인구급증현상과 분리 불가능하다. 그러나 설령 우리가 상부 구조의 상대적 작용 또는 반작용 능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에서 "최종 심급으로서의" 어떤 경제적 결정성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거꾸로, 권력메커니즘이 예를 들면 작업장 또는 공장과 같은 경제 전체의 전제가 된다. 권력의 메커니즘은 이미 안쪽으로부터 신체와 마음에 대해 작용하고 있으며, 이미 경제적 장의 내부에서 생산력과 생산 관계에 대해 작용하고 있다. "권력관계는 여타 관계 유형의 외부에 위치하지 않는다. ...[권력관계는] 상부 구조에 위치하지 않는다. ...권력관계는 스스로 직접적으로 생산적 역할을 수행하는 곳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 기능주의적 미시-분석은 마르크스주의적 이미지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피라미드적 요소를 하나의 엄격한 내재성으로 대치한다. 이 내재성 안에서 권력의 초점들 및 규율적 기술들은 온 힘을 다해 서로서로를 분절시키는 그만큼의 선분들을 형성시키고, 한 집단 내의 개인들은 -예를 들면 가족, 학교, 병영, 공장 그리고 필요하다면 감옥 등과 같은- 선분들을 통과하거나 또는 그것들 위에 머무르게 된다. 이른바 "권력"이란 어떤 초월적 통일성이 아닌 자신이 속하는 장 안에서의 내재성, 일반적 집중화가 아닌 자신이 존재하는 선 위에서의 연속성, 명확한 총체화가 아닌 자신이 맞닿은 다양한 선분들과의 인접성을 특징으로 삼는다. "권력"은 계열적 공간이다.
4. 본질 또는 속성의 요청. 권력은 그것을 소유하는 자들(즉 지배자들)을 그것이 작용하는 자들(즉 피지배자들)로부터 구분시켜 주는 하나의 본질인 동시에 속성이다. 그러나 권력은 어떤 본질도 갖지 않으며, 다만 작용하는 것일 뿐이다. 권력은 속성이 아니라 관계이다. 권력관계는 지배 세력 못지 않게 피지배 세력에 의해서도 실행되며 이 양자 모두에 의해서만 특이접들이 구성되는 다양한 힘관계들의 총체이다. "(피지배자들에게) 집중된 권력은 피지배자들에 의해 그리고 피지배자들을 가로질러 실행된다. 마치 권력에 대한 피지배자들의 투쟁에서 피지배자들이 자신들에게 권력이 실행되는 바로 그 지점들에 의존하고 있는 것과 같이, 권력은 피지배자들에 의존한다." 푸코는 후에 봉인장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통해 이른바 "왕의 자의"가 마치 왕의 초월적 권력에서 나오는 하나의 속성으로서 하향적으로 행해졌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층민, 부모, 친척, 동료의 탄원에 의한 것이었음을 보여줄 것이다. 그들은 골치 아픈 문제를 일으키는 최하층민이 수감되기를 간쳥했으며, 또한 절대 왕권을 마치 자신들의 가정, 부부, 직업, 지방의 갖가지 갈등을 조정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내재적 "공공기관"처럼 사용하였다. 봉인장은 이제 마치 우리가 정신의학에서 "자발적 수용"이라 부르는 것의 시초처럼 보인다. 권력관계는 어떤 일반적 또는 공인된 차원에서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 사이의 분쟁, 부모/자식들 사이의 언쟁, 가정불화, 지나친 음주와 섹스, 공적 쟁의 그리고 또한 은밀한 정사" 등과 같은 힘관계들, 또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특이점들이 존재하는 곳이면 어디에서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
5. 양상의 요청. 권력은 경찰력 또는 선전 활동을 통해 때로는 진압하고 때로는 기만하며 때로는 믿음을 강요하는 폭력 또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수행된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이런 양자택일은 여전히 적절치 못한 것이다(우리는 이를 정당들 사이의 의회 정치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다. 집회장소와 거리에서는 폭력이 난무한다. 의회의 연단에서는 언제나 이데올로기가 횡행한다. 그러나 권력의 구성이라는 조직상의 문제는 다른 곳, 옆방에서 은밀히 결정된다). 권력은 그것이 심지어 영혼에 작용하고 있을 때조차도 이데올로기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아니다. 권력은 그것이 육체를 짓누르고 있는 경우조차도 필연적으로 폭력이나 억압에 의해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또는 차라리 폭력이야말로 대상 또는 존재로서의 무엇인가에 대해 가해지는 특정 힘이 발생시키는 효과로서 보다 잘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폭력이 권력관계, 즉 "특정 행동에 대응하는 특정 행동", 또는 힘과 힘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힘관계는 "자극하고 촉발시키고 결합하는..." 유형의 한 기능이다. 규율사회의 경우,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으리라. 힘관계는 재분배하고 계열화하며 구성하고 규범화한다. 이 일람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무한히 달라진다. 권력은 현실을 억압하기 이전에 "현실을 생산한다". 또한 권력은 진실을 이데올로기화/추상화 또는 은폐하기 이전에 진실을 생산한다. 후에 [지식의 의지]는 섹슈얼리티를 특권적 사례로 다루면서, 만약 우리가 지배적 언표들, 특히 교회/학교/병원에서 실천되고 있으며 성의 실재와 성 안에 존재하는 진실을 동시에 추구하는 고백의 과정들을 명확히 구분해 내지 못한 채 여전히 단어와 문장에만 집착할 경우, 우리거 어떻게 이른바 '언어작용 안에서 작동하는 성적 억압'의 존재를 믿게 되는가를 밝히게 될 것이다. 또한 푸코는 억압과 이데올로기가 작동하는 어떤 "장치"(dispositif) 또는 배치(agencement)를 가정하지 않는다면, 억압과 이데올로기는 아무것도 표현하지 않으며, 그 역도 사실이 아님을 밝히게 될 것이다. 푸코는 결코 억압이나 이데올로기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니체의 고찰처럼, 힘들 사이의 투쟁은 억압과 이데올로기에 의해 구성되지 않는다. 억압과 이데올로기는 단지 그 투쟁의 와중에서 결과적으로 피어오르게 되는 미세한 흙먼지들에 지나지 않는다.
6. 합법성의 요청. 국가 권력은 법 안에서 스스로를 표현하며, 이 법은 때로는 야만적 힘들 위에 부과된 평화 상태, 또 때로는 가장 강한 자들이 승리한 투쟁 또는 전쟁의 결과로서 인식되는 것이다(그러나 이 두 경우 모두 법은 한 전쟁의 자발적 또는 강제적 중지로서 정의되며 법에 의해 배제로서 규정되는 위법성에 반대된다. 그리고 혁명가들은 단지 권력의 획득과 새로운 국가기구의 설립에 의해 가능해지는 또 하나의 합법성을 내세울 수 있을 따름이다.) 푸코의 이 책이 갖는 가장 심오한 주제들 중 하나는 '법-위법성'이라는 이전의 거대한 대립을 위법 행위들-법들이라는 섬세한 상관관계로 대체시킨 점에 있다. 법은 언제나 자신과의 차별화를 통해 형성되는 다양한 위법 행위들에 의해 구성된다. 이와 연관해 우리는 상행위에 관련된 일련의 법률들을 간단히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법과 위법성이 서로에 대해 전반적으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이들 중 하나는 나머지 하나를 회피하려는 명백한 목적 아래 구성된 것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법은 위법 행위들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법이 허용하는 어떤 행위들은 지배 계급의 특권이라는 명목 하에 발명되거나 가능해진다. 또 다른 어떤 행위들은 피지배 계급에 대한 보상으로서 묵인되거나, 때로는 심지어 지배자들에게 봉사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법의 대상으로 간주되지만 어떤 경우에도 역시 하나의 지배 수단으로 간주되면서 금지, 고립되는 일련의 행위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해서 18세기 전반에 걸쳐 일어났던 법의 변화는 근본적으로 위법 행위들에 대한 새로운 배치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는 단지 당시의 범법 행위(infraction)가 점차로 개인보다는 재산에 관한 것으로 그 성질이 변화했다는 점뿐만 아니라, 규율권력이 이런 범법 행위들을 "비행"(delinquance)이라 명명된 하나의 고유한 형식으로 구정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구분하고 형식화했다는 점에 기반한 것이다. 이런 "비행"의 규정은 위법 행위들에 대한 새로운 차별화 및 관리방식을 가능케 했다. * 9) 일간지 [르 몽드] 1975년 2월 21일자에 실린 인터뷰에서 푸코는 이렇게 말했다. "위법 행위들은 다소간 불가피했던 어떤 결함 또는 사고가 아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나는 법이 이러저런 유형의 행위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 그 자체를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들 사이의 구분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말하고 싶다." * 이는 1789년의 대혁명에서 보인 인민의 저항들 중 몇몇은 구체제 하에서 용인되고 이해되었던 위법 행위들이 새로운 공화주의 권력 아래에서는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명확히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서구 공화제와 군주제 모두에 공통적 요소는 이른바 '법'이라는 실체를 권력의 기초적 원리로 간주하는 시각이었고, 이는 그 자체를 법적 동질성을 갖는 재현작용으로서 확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법적 모델"이 전략적 지도를 뒤덮게 되었다. * 10) 푸코는 결코 "법치 국가"의 숭배에 동참하지 않았다. 또한 푸코에 따르면 법치적 개념이 억압적 개념에 비해 그리 나은 것도 아니다. 두 경우 모두 우선시되는 것은 권력 개념 그 자체이며, 법이란 단지 어떤 경우에는 욕망에 대한 하나의 외적 반응으로서, 또 다른 경우에는 욕망에 대한 하나의 내적 조건으로서 나타나는 어떤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위법 행위들의 지도는 합법성의 모델에 따라 계속 기능한다. 또한 푸코는 법이 더 이상 어떤 성공한 전쟁의 결과 또는 어떤 평화의 상태가 아님을 보여 주었다. 법은 전쟁 자체이자, 교전 중인 이 전쟁의 전략이다. 그리고 이는 권력이 지배 계급에 의해 획득된 어떤 소유물이 아니라, 그 전략의 현실적 실천 행위인 것과 정확히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마르크스 이후의 새로운 무엇인가가 솟아오른다. 이렇게 해서 '국가'를 둘러싼 모종의 공범 관계가 위기에 처하게 된다. 푸코는 단지 몇몇 개념들을 재검토해보아야 한다는 말에 만족하지 않는다. 아니, 푸코는 시밎어 그런 말조차 하지 않는다. 푸코는 단지 그것을 행동에 옮긴다. 그리고 푸코는 이제 실천을 위한 새로운 세부 지침들을 제시한다. 이면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는 총체화가 아니라 오히려 중계(relais), 연결(raccordement), 수렴(convergence), 연장(prolongement)에 의해 진행되는 국지적 전술들 그리고 전반적 효과들과 함께 하나의 새로운 투쟁이 폭발하려 한다. 문제는 오직 다음과 같은 질문이다. 무엇을 할것인가?(Que faire?) 권력 기구로서의 '국가'에 대해 우리가 부여하는 이론적 특권은 어떤 면에서는 국가 권력을 쟁취하고자 하는 중앙집권적, 지도적 정당이라는 실천적 개념으로 우리를 이끌기도 한다. 그러나 실은 이와 반대로 이런 권력 이론에 의해 정당의 조직 개념이 정당화된다. 푸코의 이 책이 의도하는 것은 또 다른 이론, 또 다른 투쟁적 실천, 또 다른 전략적 조직이다. p.50-60
그러나 한편으로 감옥은 신체를 다루는 하나의 새로운 방식이며, 따라서 이전의 형법과는 전혀 다른 하나의 지평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온갖 규율들이 엄격히 집중된 이 감옥이라는 형식은 18~19세기의 전환기에 규정되었던 형벌 체계에서 파생된 요소가 아니다." 형법은 범죄적 요소들의 언표 가능한 것에 관계한다. 범법 행위들을 구분하고 해석하며 형벌들은 계산해 내는 것은 바로 이런 언어작용의 체제이다. 이는 하나의 언표 가족이자, 하나의 문턱이다. 감옥은 이제 가시적인 것에 관계한다. 감옥은 범죄와 범죄자가 보여지기를 원할 뿐 아니라, 그 자신을 하나의 가시성으로서 구성한다. 또한 감옥은 돌로 지어진 어떤 형상이기에 앞서 특정한 빛[봄]의 체제(regime de lumiere)로서, 무엇보다도 자신을 "판옵티콘"으로서 정의한다. 판옵티콘이란 간수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모든 죄수들을 감시할 수 있으나, 죄수들은 매 순간 감시될 뿐 간수들을 볼 수 없도록 고안된 하나의 시각적 현경 및 빛의 배치를 의미한다. * 13) [본 역서에서는 이를 판옵티콘으로 옮긴다. 이는 pan+optisme이란 어원을 갖는다. 일망감시법, 원형감옥 등으로 옮기기도 한다. 이는 [감시와 처벌]에 실린 감옥의 설계도,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감옥의 구조적 특성에서 기인한 말이다. 판옵티콘은 공리주의의 창시자이기도 한 영국의 벤담이 최초로 고안, 설계했다.]* 빛의 체제와 언어의 체제는 동일한 형식이 아니며, 마찬가지로 동일한 형성과정을 갖지도 않는다. 우리는 이제 푸코가 왜 이전의 저작들을 통해 끊임없이 이 두 가지 형식에 대한 탐구를 지속해 왔는가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임상의학의 탄생]은 가시적인 것과 언표 가능한 것을 [광기의 역사]는 로피탈 제네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광기와 의학에서 언표되는 비이성을 언급했다(이는 17세기까지만 해도 의학의 대상에 속하지 않았다). [지식의 고고학]에서 비담론적 환경이라는 이름 아래 부정적으로 인식되었던 것은 [감시와 처벌]에 이르러 이후 푸코의 모든 저작들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받게 될 긍정적 형식을 획득하게 되는데, '언표 가능성 형식'과의 차이에 의해서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가시성 형식'이 그것이다. 예를 들면, 대중과 인구는 19세기 초에 들어서면서 가시화되어 조명을 받게 되었고, 이와 동시에 의학적 언표들이 새롭게 언표 가능성을 획득했다(세포손상과 해부생리학적 상관관계 등...).
물론 내용형식으로서의 감옥은 그 자체로 자신의 언표 및 규칙을 갖는다. 물론 비행의 언표들, 즉 표현형식으로서의 형법 또한 자신의 내용을 갖는다. 범법 행위의 이 새로운 유형은 개인에 대한 공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재산에 대한 침해가 된다. 그리고 이 두 형식들은 서로 끊임없이 접촉하고 스며드는 동시에 상대로부터 각기 하나의 선분을 탈취해 낸다. 형법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감옥으로 보내고 죄수들을 공급하는 한편 감옥은 끊임없이 비행을 재생산하고 어떤 "대상"을 만들어 낸다. 또한 감옥은 또 다른 방식에 의해 형법이 의도하는 목표들을 현실화한다(사회의 방어, 수형자의 개조, 형벌의 조정, 개별화). 물론 이 두 형식들 사이에는 상호적 전제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 사이에는 어떤 공통 형식 또는 동일한 상응성 내지는 일관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감시와 처벌]은 바로 이 지점에서 '지식'과 지식에 있어서의 언표에 우위를 부여했던 [지식의 고고학]이 결코 제기할 수 없었던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첫째, 사회적 장에 내재하는 어떤 공통 원인이 형식들 외부의 일반적 차원에 존재하고 있는가? 둘째, 이 두 형식의 배치, 조정 및 상호 침투는 구체적인 개별적 경우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형식은 그 자체로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우선 형식은 내용을 형성 또는 구성한다. 또한 형식은 다양한 기능들을 형성 또는 목적화하면서 목표를 부여한다. 감옥뿐 아니라 병원, 학교, 병영, 공장까지도 이미 형성된 내용들이다. 처벌은 하나의 형식화된 기능일 뿐만 아니라, 보살피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노동하게 만드는 것이다. 현실에서 이 두 형식은 일종의 대응 관계를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 이 두 형식은 서로 환원 불가능하다. 사실상 보살핌이란 17세기의 로필탈 제네랄과는 무관한 개념이며, 18세기의 형법 또한 감옥과는 본질적으로 아무 연관도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호 결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우리는 자료들 및 기능들을 현실화하는 형기들을 추상화해 봄으로써 순수 내용들 및 순수 기능들을 구분해 볼 수 있다. 푸코는 판옵티콘을 떄로는 구체적으로 감옥을 특징짓는 하나의 광학적 또는 빛의 배치로서, 또 때로는 추상적으로 -단순히 (감록과 공장, 병영, 학교, 병원 등과 같은) 일반적인 가시적 내용을 넘어서는- 모든 언표 가능한 기능들을 일반적으로 가로지르는 하나의 기계(machine)로서 정의한다. 따라서 판옵티콘의 추상적 공식은 "(자신은) 보여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것"(voir sans etre vu)이 더 이상 아니다. 그것은 어떤 인간적 다수성에 대해 특정한 품행방식을 부과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을 명확히 확인해 두어야 한다. 이때의 다수성은 제한된 특정 공간 안에 한정되어 파악된 것이며, 특정한 품행의 부과 역시 주어진 특정 공간 안에서의 분배이자, 주어진 특정 시간 안에서의 질서화 및 계열화인 동시에, 주어진 특정 시공간 내에서의 구성이다... . 이는 하나의 무한한 목록이지만, 그것은 동시에 언제나 서로 분리 불가능한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는 두 변수들, 즉 형성작용 또는 조직되지 않은 '내용들', 아직 형식화 또는 목표화되지 않은 '기능들'에 연관되어 있다. 이 비정형적인(informelle) 새로운 차원을 우리는 무엇이라 불러야 할까? 푸코는 이에 대해 실로 너무도 정확한 하나의 이름을 부여했다. 그것은 하나의 "다이어그램"(diagramme)이며 "모든 장애와 마찰로부터 추상화된 하나의 기능이다. ... 우리는 이를 모든 다른 특정 용법들로부터 구분해야만 한다". 다이어그램은 더 이상 듣거나 볼 수 있는 문서고가 아니며, 다만 모든 사회적 장과 외연을 함께 하는 지도이자 지도제작법일 뿐이다. 다이어그램은 하나의 추상기계이다. 비정형화된 내용 및 기능에 의해 정의되는 다이어그램은 내용과 표현 사이의, 담론 형성작용과 비담론 형성작용 사이의 모든 형식적 구분을 무시한다. 그것은 그 자신 보게 하고 말하게 만드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거의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하나의 기계이다.
만약 다이어그램에 수많은 기능 그리고 심지어는 내용이 존재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선 모든 다이어그램이 하나의 특정한 시공간적 다수성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는 또한 역사 안에는 주어진 사회적 장의 수들만큼의 다이어그램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푸코가 다이어그램의 개념을 내세운 것은 권력이 사회의 모든 장들을 분할하는(quadrille) 우리의 규율적 근대 사회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규율사횐의 모델은 전염된 도시를 분할시키고 도시의 모든 구석구석까지 스며드는 "페스트"의 모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전의 군주제 사회들을 살펴볼 경우에도, 우리는 그런 사회들 역시 -비록 상이한 내용 및 기능을 통해서이긴 하지만- 자신만의 다이어그램들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사회들에서도 역시 하나의 힘이 다른 힘들에 대해서 행사되었다. 그러나 이런 힘의 행사는 어떤 조합 또는 구성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선취를 위한 것이었으며, 또한 세부의 단절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대중의 분배를 위한 것이었고, 분할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오히려 추방을 위한 것이었다(이는 "나병"의 모델이다). 그리고 이는 공장보다는 오히려 극장에 더 가까운 또 하나의 다이어그램, 기계일 것이다. 그것은 결국 또 다른 힘관계들이다. 나아가 우리는 하나의 사회에서 다른 사회로 이행하는 것으로서의 매개적 다이어그램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전제성의 군주적, 제식적 실천과 무한한 규율의 지속적, 위계적 실천이 맞물리는 지점에서" 규율적 기능이 전제적 기능과 맞물리게 되는 나폴레옹적 다이어그램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다이어그램은 근본적으로 불안정하고 유연한 것이며 끊임없이 변이들을 구성해 내는 방식으로 내용과 기능을 뒤섞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모든 다이어그램은 간-사회적이며 또 생성 중인 것이다(intersocial, et en devenir). 다이어그램은 결코 이미 존재하는 어떤 세계를 재현하기 위해 기능하지 않는다. 다이어그램은 다만 하나의 새로운 실재 유형, 하나의 새로운 진실 모델을 생산한다. 다이어그램은 역사의 주체 또는 역사 위에 우뚝 솟아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니다. 다이어그램은 기존의 의미 작용과 현실을 해체하고, 출현 또는 창조, 예기치 못한 접속, 불가능할 듯이 보이는 연속체의 지점들을 구성하면서 역사를 만들어 낸다. 다이어그램은 특정 생성방식과 함께 역사를 이중화한다.
모든 사회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이어그램들을 갖는다. 정교하게 결정되어 있는 계열들에 기초하여 신중하게 작업을 수행했던 푸코는 결코 이른바 원시(primitives)사회들에 대해서는 직접적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렇지만 아마도 이런 사회들 역시 다이어그램의 매우 적절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사회들 역시 자신만의 정치와 역사를 갖고 있으며, 친족구조로부터 귀납되거나 혈족들 사이의 교환 관계로 환원될 수 없는 결합(alliances)의 그물망을 갖기 때문이다. 결합 관계는 지역적인 소그룹들로부터 생겨나고 힘관계들을 구성하며(증여와 역-증여) 또한 권력을 관리한다. 다이어그램은 여기서 구조와의 차이점을 드러낸다. 결합 관계는 수직적 구조에 대해 직각으로 교차되는 수평적이며 유연하고 횡단적인 그물망을 직조하면서, 여타의 모든 결합들로부터 구분되는 하나의 실천, 진행, 전략을 결정하며, 폐쇄적인 교환의 순환 대신 지속적인 비평형 상태의 불안정한 물리적 체계를 형성해 낸다. 그리고 리치와 레비-스트로서 사이의 논쟁, 부르디외의 이른바 '전략 사회학'은 이로부터 탄생한 것이다. 나는 그렇다고 푸코의 권력 개념이 그가 다루지도 않았던 원시 사회들에 특별히 적합하다고 결론지으려는 것은 아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푸코가 말하는 근대 사회 역시 자신만의 힘관계들 또는 특수한 전략들을 표출하는 특정 다이어그램들을 발전시킨다는 사실이다. 실상 우리는 -원시적 연계이든 또는 근대적 제도이든- 언제나 거대한 전체적 수준과의 연관 아래 미시관계들(micro-rapports)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 이런 미시관계들은 위와 같은 보다 거시적인 관계들을 파괴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이들을 구성하는 것이다. 드 타르드가 자신의 '미시사회학'을 확립하면서 수행했던 것은 바로 이런 작업이었다. 드 타르드는 '개인적인 것'으로 '사회적인 것'을 설명하지 않는다. 반대로 드 타르드는 '무한히 작은 관계들'을 설정함으로써 거대한 집합들을 설명한다. 드 타르드는 "모방"(imitation)을 신념 또는 욕망(quanta)이라는 흐름의 전파로서, "발명"(invention)을 두 모방적 흐름의 만남으로서 설명한다... . 무한히 작은 관계들은, 단순한 폭력을 넘어서는 만큼, 진정한 힘관계이다.
하나의 다이어그램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다이어그램은 앞서 분석했던 다양한 특성들을 따라 권력을 구성하는 힘관계들의 표출이다. "판옵티콘 장치는 권력의 메커니즘과 기능 사이에 존재하는 단순한 하나의 저장소 또는 변환점이 아니다. 판옵티콘은 특정 기능 안에서 권력관계들이 기능하도록 만드는 특정한 방식이고, 마찬가지로 하나의 기능은 그런 권력관계들에 의해서만 비로소 작동된다." 우리는 힘관계 또는 권력관계가 미시물리학적이고 전략적이며 복수의 점들에 걸쳐 있는 분산적 관계임을 이미 살펴보았다. 또한 우리는 이런 관계들이 특이점들을 결정하고 순수한 기능들을 구성하는 것임을 알고 있다. 다이어그램 또는 추상기계는 어느 한 지점으로 수렴 불가능한 원초적 연계작용들에 의해 진행되며 매 순간 모든 점들 "또는 차라리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이행하는 모든 관계들 안을 통과하는 밀도 및 강도의 지도, 힘관계들의 지도이다. 물론 다이어그램은 어떤 초월적 '이념' 또는 이데올로기적 상부구조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마찬가지로 다이어그램은 실체로 규정되면서 자신만의 형식과 용법에 의해 정의되는 경제적 하부구조와도 더 이상 관련되지 않는다. 다이어그램은 이제 모든 사회적 장과 동일한 외연을 공유하면서도 결코 어떤 통합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하나의 내재적 원인처럼 작동한다. 추상기계는 마치 힘관계들을 실현하는 구체적 배치들의 원인과도 같다. 그리고 이런 힘관계들은 "위쪽으로"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생산하는 배치들의 조직 자체 안에서 생겨난다.
여기서 내재적 원인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재적 원인은 자신의 효과 안에서 현실화되고, 자신의 효과 안에서 통합되며, 자신의 효과 안에서 차이를 낳는 그런 원인이다. 또는 오히려 내재적 원인은 효과가 그것을 현실화하고 통합하며 차이를 낳는 그런 원인이다. 또 이런 원인과 효과 사이, 추상기계와 구체적 배치(agencement) 사이에는 상호전제 또는 상관관계가 존재한다(푸코는 배치 대신 "장치들"dispositifs이란 명칭을 더 자주 사용했다). 만약 효과들이 현실화된다면, 그것은 힘관계 또는 권력관계가 잠재적, 가능적, 불안정적, 소거적, 분자적인 것이기 때문이자 또한 단순히 상호작용의 가능성과 확률만을 정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힘관계 또는 권력관계는 결코 하나의 형식에 대해 그것이 갖는 유연한 내용과 분산적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거시적 집합에 속하지 않는다. 다른 한편, 현실화는 처음에는 국지적이나 이후 일반적 또는 일반적이 되려는 경향을 가지면서 힘관계들의 정렬(alignement), 동질화(homogeneisation), 총합화(sommation)를 실현하는 하나의 통합작용(integration), 또는 그런 점진적 통합작용들의 총체이다. 위법 행위들에 대한 통합작용으로서의 법(la loi comme integration des illegalismes). 학교, 공장, 군대... 등의 구체적 배치들은 (어린이, 노동자, 군인과 같은) 규정된 실체들 및(교육 등과 같은) 목적화된 기능에 대한 통합을 작동시킨다. 그 범위는 '국가', 나아가 전지구적 '시장'에까지 이르게 된다. 결국 통합화-현실화는 하나의 차이화이다. 그 이유는 이때 현실화되고 있는 원인이 어떤 주권적 '단위'(Unite souveraine)이기 때문이 아니다. 반대로 다이어그램적 다수성이 현실화되고 힘들의 차이화가 통합화되는 것은 오직 그것이 다양한 경로를 취하고 이원적으로 나뉘면서 차이화의 선(이것이 없다면 모든 것이 어떤 비실제적 원인의 분산에 그치게 될 것이다)을 따를 경우에만 가능하다. 현실화는 오직 탈이중화(dedoublement) 또는 탈결합(dissociation) 작용에 의해서만, 또 그 안에서 스스로가 분할되는 다양한 형식들의 창조 작용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계급들, 또는 통치하는 자와 통치되는 자,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이라는 거대한 이중성이 출현하는 것은 이런 작용으로부터이다. 표현형식과 내용형식, 담론적 형식과 비담론적 형식, 가시적인 것의 형식과 언표 가능한 것의 형식이라는 현실화의 두 형식이 분열 또는 차이화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이는 정확히 내재적 원인이 -한편으로는 가시적 자료들을 형성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언표 가능한 기능들을 형식화하는- 하나의 중심적 차이화 작용을 따르면서 자신을 현실화하는 형식들을 내용과 기능의 양 측면 모두에서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시적인 것과 언표 가능한 것 사이에는 어떤 균열(beance), 이접(disjonction)이 존재한다. 그러나 동시에 형식들 사이의 이런 균열 또는 이접은 비정형적 다이어그램이 흘러 들어가고, 앞서 언급한 두 방향 안에서 필연적으로 서로에 대해 환원 불가능하게 되고 차이화되며 분산되고 구체화되는 장소(lieu)이다. 그리고 푸코는 이를 "비-장소"(non-lieu)라고 불렀다. 구체적 배치들은 따라서 추상기계가 스스로를 현실화하는 이 틈새(interstice)에 의해 갈라진다.
이것이 [감시와 처벌]이 제시했던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대답이다. 첫째, 형성작용 또는 형식화의 이원성은 비정형적인 것들 안에서 작동하는 내재적 공통원인을 배제하지 않는다. 둘째, 각각의 경우 각각의 구체적 장치 안에서 작동하는 이 공통원인은 두 형식이 갖는 요소들 또는 선분들이 설령 환원 불가능하며 이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들 사이의 혼합, 포획, 방해를 끊임없이 측량한다. 모든 장치는 가시적인 것과 언표 가능한 것을 뒤섞어 놓은 혼합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감금 체계는 담론과 건축", 프로그램과 메커니즘을 "하나의 동일한 형상 안에서 결합한다". [감시와 처벌]은 푸코의 이전 책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원론을 명백히 넘어선 책이다.(물론 이 이원론은 이미 당시에도 다수성의 이론으로 이행 중이었다). 만약 지식의 기능이 가시적인 것과 언표 가능한 것을 서로 얽히게 만드는 것에 있다면, 권력은 지식이 전제하는 원인이며 반대로 권력은 자신이 현실화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분화, 차이화로서의 지식을 필요로 한다. "지식의 장과 상관적으로 구성되지 않는 권력관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권력관계를 전제하거나 구성하지 않는 지식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힘관계가 유보된 지점에서만 지식이 나타난다고 믿는 것은 오류이자 위선이다. 특정 유형의 권력으로도 되돌아가지 않는 진실 모델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현실에서 수행되고 있는 특정 권력을 표현하거나 함축하지 않는 지식, 심지어는 과학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지식은 가시적인 것에서 언표 가능한 것으로, 또 그 반대로 이행중이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는 전체화를 지향하는 어떤 공통 형식, 또는 심지어는 어떤 1:1 대응 관계, 일치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것은 오직 형식들의 이중성 안에서 자신의 고유한 작용 및 현실화의 조건을 발견하며 횡단적으로 작용하는 특정의 힘관계뿐이다. 만약 형식들 사이에 일정한 상호적응성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형식들 사이의 "만남"에서 유래하는 것이지, 그 역이 아니다. 물론 이때의 강조점은 '만남'에 있다. "만남은 오직 자신이 확립하는 새로운 필연성에 의해서만 정당화된다." 이렇게 해서 감옥의 가시성과 형법의 언표 사이의 만남이 이루어진다. p.62-74
추상기계와 구체적 배치들은 두 개의 극을 구성하고 있으며,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한 쪽 극에서 다른 극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선, 이 배치들은 때로 칸막이와 물샐틈없는 장벽 또는 형식적 불연속성에 의해 명확히 분리되는 견고하고 단단한 선분들 안에 분포되어 있다(학교, 군대, 공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옥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군대에 들어가는 즉시 그들은 우리에게 "넌 더 이상 학생이 아니야"라고 말한다). 다음으로, 이 배치들은 때로 그와는 반대로 유연하고 분산적인 미시선분성을 자신에게 부여해주는 추상기계 안에서 상호 소통한다. 이렇게 해서 배치들은 모두 서로 닮아가며, 감옥은 형식 없는 하나의 동일한 기능, 또는 하나의 연속적 기능들이 갖는 변수로서, 다른 배치들을 횡단하면서 스스로를 확장한다(학교, 병영, 작업장은 이미 감옥이다...). 우리가 만약 하나의 극에서 또 다른 극으로 끊임없이 움직인다면, 이는 각각의 배치들이 그 자체로 각각의 정도만큼 추상기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다이어그램의 실행을 위한 계수들이다. 이 계수의 정도가 클수록 배치 역시 다른 배치들 속으로 더욱더 분산되면서 사회적 장 전체를 뒤덮게 된다. 푸코의 방법론이 최고의 유연성을 획득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이다. 왜냐하면 계수란 무엇보다도 하나의 배치에서 다른 배치로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해군 병원은 회로들(circuits)의 교차점에 위치하면서 온갖 방향으로의 여과 및 변환 작용을 지향하고 온갖 종류의 유동성을 통제하면서, 이를 통해 전체 다이어그램을 뒤덮는 하나의 의학적 공간, 고밀도의 교차점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동일한 하나의 배치에 대해서도, 계수는 때로는 하나의 사회적 장으로부터 다른 사회적 장으로, 때로는 하나의 동일한 사회적 장 안에서 늘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감옥의 세 단계가 나타난다. 1) 군주제 사회의 감옥은 전제성이라는 다이어그램을 낮은 정도로만 실현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벌이라는 또 다른 배치와는 동떨어진 것으로 남아 있었다. 2) 이후, 감옥은 반대로 모든 방향으로 분산되기 시작하면서 형법의 목적 실현을 떠맡고 여타의 배치들에까지도 스며들게 된다. 감옥은 이제 규율의 다이어그램이 요구하는 조건들을 고도로 실현한다(그러나 여전히 감옥은 이전에 자신이 수행했던 역할에서 비롯된 "악명"을 극복해야만 한다). 3) 그러나, 마지막으로, 앞으로 규율사회가 더욱 발달하면서 형벌의 목적을 현실화하고 그것을 다이어그램의 모든 부분에서 실현하는 새로운 수단들이 발견되더라도 감옥이 여전히 지금과 같은 고도의 계수를 보존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불분명하다. 나아가 사회적 장에서 앞으로 더욱 자주 논의될 감옥 제도의 개혁, 극단적으로는, 결국 감옥을 국지적이고 한정된 고립적 배치의 단계로 다시 끌어내림으로써 감옥의 대표성을 박탈하고자 시도하는 논제가 존재한다. 모든 것은, 마치 규율 다이어그램의 실현 정도를 나타내는 눈금 위에서 부침하는 감옥처럼, 나타나고 또 사라진다. 마치 다이어그램의 생성과 변이가 존재하는 것처럼, 배치들의 역사가 존재한다.
이는 단지 푸코의 방법론에 한정되는 특징에 그치지 않으며 푸코의 전체 사상에서 커다란 중요성을 갖는다. 우리는 종종 푸코를 무엇보다도 감금의 사상가였던 것처럼 간주해 왔다. 그러나 푸코는 전혀 그런 인물이 아니며, 이런 오해는 우리가 푸코의 전체적 기획을 파악하는 데 큰 방해가 되어 왔다. 예를 들면 폴 비릴리오는 근대 사회의 문제, "내치"의 문제는 감금의 문제가 아니라 열려진 공간 안에서의 우회와 분할, 속도의 지배와 통제, 속도와 가석, 즉 "도로"의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푸코를 반박한다. 그렇지만 실은 푸코 역시 이와 동일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 두 저자가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요새에 대한 분석, 그리고 푸코의 해군 병원에 대한 분석이 이런 점을 잘 보여 준다. 그러나 비릴리오의 오해와 같은 경우는 그리 심각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비릴리오의 연구 방식이 보여 주는 힘과 독창성은 독립적 사상가들끼리의 만남은 언제나 일정한 맹목성을 띠게 됨을 단적으로 증명하기 때문이다. 반면 보다 둔한 작가들이 기존의 비판에만 집착하면서 푸코가 오직 감금의 분석에만 머물러 있었다고 비난하거나 또는 반대로 푸코가 감금 형식에 대한 너무도 훌륭한 분석을 수행했다고 일방적으로 찬양할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실상 푸코에게 있어 감금은 언제나 또 다른 우선적 기능에 의해 파생된 부차적 소재에 지나지 않았고, 더욱이 그것은 매번의 경우마다 매우 다양한 모습을 갖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더욱이 17세기의 로피탈 제네랄 또는 수용소가 광인드을 감금했던 방식과 18세기~19세기에 감옥이 비행인들을 감금했덤 방식은 전혀 다르다. 광인들의 감금은 "추방"의 양식 또는 나병 환자의 모델에 따라 수행되었고, 비행인들의 감금은 "분할"의 양식 또는 페스트 환자의 모델에 따라 수행되었다. 이런 분석들이 푸코 저작의 가장 탁월한 페이지들을 채우고 있다. 그러나 분명히 추방과 분할은 무엇보다도 감금의 장치들에서만 실현되고 형식화되며 조직되는 외재성의 기능들이다. 독방들로 구성된 견고한 선분성으로서의 감옥은 유연하고 유동적인 하나의 기능, 잘 통제된 하나의 순환, 자유로운 환경들을 가로지르면서 감옥으로부터 도피하는 방식을 가르쳐 주는 하나의 그물망 전체에로 귀속된다. 이는 어떤 체포 또는 선고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카프카의 "무한한 지연"과 상당히 닮아 있다. 블랑쇼가 푸코에 대해 이렇게 말한 것처럼, 감금은 하나의 바깥으로 되돌아가고, 감금된 것은 다름 아닌 바깥이다. 감금은 바깥"에" 둠 또는 배제라는 배치에 의해 행해지는데, 이는 신체적 감금뿐만 아니라 정신적 내재성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행해진다. 푸코는 종종 담론적인 것의 형식, 비담론적인 것의 형식에 호소한다. 그러나 이런 형식들은 아무것도 감금하지 않으며, 어떤 것도 내재화하지 않는다. 때로는 언표들이 때로는 가시적인 것들이 이 "외재성의 형식들"을 가로질러 스스로를 분산시킨다. 그것은 일반적 방법론의 문제이다. 드러나 있는 어떤 외재성으로부터 본질적이라고 가정되는 어떤 표면적인 "내재성의 핵"에로 옮겨 가는 대신, 우리는 말과 사물을 그들의 '구성적 외재성'에 돌려주기 위해 우선 환상적 내재성을 배척해야만 한다.
우리는 적어도 세 가지의 상관적 심급들을 구분해야만 한다. 1)우선, 힘들의 비정형적 요소로서의 바깥(le dehors)이 있다. 힘들은 바깥으로부터 생겨나고, 바깥에 의존한다. 한편 바깥은 그것의 관계들을 휘젓고, 그것의 다이어그램들을 추출해낸다. 2)또한 두 번째로, 힘관계들이 현실화되는 구체적 배치들의 환경으로서의 외부가 있다. 3)마지막으로, 외재성의 형식들이 있다. 이는 현실화가 서로에 대해 외부적이고 차별화되면서 배치들을 분할하는 두 형식들 사이의 어떤 분열 또는 분리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감금과 내재화interiorisations는 이런 형식들의 표층에 존재하는 과도기적 형상에 불과하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른바 "바깥의 사유"라 불리는 이 집합 전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제 푸코의 사유에서는 결코 어떤 것도 사실상 닫힌 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히 설명되지 않았을까. 형식들의 역사 곧 문서고는 힘들의 생성 곧 다이어그램에 의해 이중화된다. 그것은 힘들이 "한 점에서 다른 점에 이르는 모든 관계들"(toute relation d'un point a un autre)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하나의 다이어그램은 한 장의 지도, 또는 차라리 수많은 지도들의 중첩이다. 나아가 하나의 다이어그램에서 다른 다이어그램으로 이행하면서 수많은 새로운 지도들이 만들어진다. 또한 자신이 연결하는 무수한 점들 곁에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느슨한 점들, 곧 창조성과 변이와 저항의 점들을 갖지 않는 다이어그램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아마도 이런 점들로부터 출발해야 할 때에만 전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각 시대의 투쟁들 및 이 투쟁들의 스타일로부터 출발할 때에만 다이어그램들의 이어짐, 또는 불연속성을 넘어서는 다이어그램들 사이의 되-묶임(re-enchainement)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각각의 다이어그램들이란 멜빌이 말했던 바깥의 선(ligne du dehors)이 뒤틀리는 방식을 증명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이 바깥의 선은 온갖 저항점들을 지나면서 언제나 가장 새로운 것들과 함께 작용하면서, 다이어그램들을 굴리고 서로 부딪치게 만드는 시작도 끝도 없는 대양적 선이다. 1968년은 얼마나 놀라운 선의 뒤틀림이었던가! 수천 개에 이르는 일탈선의 뒤틀림! 이로부터 글쓰기에 대한 삼중의 정의가 나타난다. 글쓰기는 투쟁, 저항이다. 글쓰기는 되기(devenir)이다. 글쓰기는 지도 그리기이다. "나는 한 명의 지도제작자이다... ." p.78-82
실증성 또는 경험성으로 불리는 지층들은 언제나 일련의 역사적 형성작용들이다. "퇴적층들"은 사물과 말, 보기와 말하기, 볼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있는 것, 가시성의 해변과 가독성의 들판, 내용과 형식에 의해 형성된다. 우리는 옐름슬레우로부터 이 마지막 용어를 차용해 왔다. 하지만 우리가 이를 푸코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에서인데, 이는 더 이상 내용과 시니피에, 표현과 시니피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매우 엄격한 새로운 재분배를 필요로 한다. 내용은 하나의 형식(forme)과 하나의 실체(substance)를 갖는데, 예를 들면, 형식으로서의 감옥과 실체로서의 수감된 자들, 죄수들이 그것이다(누가? 왜? 어떻게?). 표현형식으로서의 형법은 발화 가능성의 장을 결정한다(비행의 언표들). 마찬가지로 내용형식으로서의 감옥은 가시성의 장소를 결정한다("판옵티콘"이란 매 순간 자신은 보여지지 않은 채 다른 이들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장소이다). 이런 예들은 푸코가 [감시와 처벌]에서 행했던 지층에 대한 최후의 위대한 분석에 의거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이미 [광기의 역사](1961)의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고전시대의 수용소는 광기에 대한 하나의 가시적 장소로서 출현했으며, 이와 동시에 의학은 "비이성"에 관한 기초적 언표들을 형성했다. 이 두 권 사이에는 [레몽 루셀]과 [임상의학의 탄생, 의학적 시선의 고고학]이 있다. [레몽 루셀]은 루셀의 작품들이 어떻게 '일련의 놀라운 기계들을 따르는 가시성의 창조작용'과 '하나의 기묘한 "절차"를 따르는 언표들의 생산작용'이라는 두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잇는가를 보여 준다. [임상의학의 탄생]은 임상의학과 병리해부학이라는 전혀 다른 영역에서 어떻게 이들이 "가시적인 것과 언표 가능한 것" 사이의 가변적 분포들을 만들어 내는가를 보여 준다. p.85-86
각각의 지층들은 말하는 방식과 보는 방식, 담론성과 명증성이라는 두 요소들의 조합에 의해 형성된다. 한편 하나의 지층에서 다른 하나의 지층으로 옮겨 가는 과정에는 이 요소들 및 요소들 사이의 조합에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푸코가 '역사'에 기대한 것은 각각의 시대에 있어 가시적인 것들 및 언표 가능한 것들에 대한 이런 결정작용(determination)이다. 이 결정작용은 행위(comportenents), 멘털리티(mentalities), 이념(idees)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 이들을 넘어선다. 그러나 '역사'가 이렇게 응답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푸코가 -의심의 여지 없이 역사가들이 고안한 새로운 몇몇 개념들과의 연관 하에- 철학적 질문제기의 고유한 방식을 창조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그 자체로 새로운 방법인 동시에, '역사'에 대해서도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지층화(stratification)의 두 요소들, 즉 언표 가능한 것 및 가시적인 것, 담론 형성작용 및 비담론 형성작용, 표현형식 및 내용형식에 관한 일반화된 이론을 형성하고 방법론적 결론을 이끌어 내었던 책은 [지식의 고고학]이다. 이 책은 그러나 언표에 근본적 우위(primat)를 부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책에서 가시성의 해변은 오직 언표적 장의 보충적 공간에 불과한 "비담론 형성작용들"이라는 부정적 방식으로만 묘사된다. 푸코는 담론적 언표와 비담론적 언표 사이에 담론적 관계들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푸코는 결코 비담론적인 것이 하나의 찌꺼기 또는 환상이라거나, 언표에로 환원 가능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지식의 고고학]에 나타나는 우위성의 문제는 본질적이다. 언표가 우위를 갖는데, 우리가 탐구해야 할 것은 그 이유이다. 물론 이때의 우위가 환원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책 전체를 가로질러, 가시성은 결코 언표로 환원시킬 수 없는 것으로서 남아 있는데, 가시성은 그것이 언표작용과 관련된 일종의 정념을 형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만큼이나 환원 불가능하다. [임상의학의 탄생]의 부제는 "시선의 고고학"이다. 푸코는 언제나 자신의 이전 저작들을 수정해 왔으므로, 그가 이 부제 역시 폐기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는 푸코가 왜 몇몇 경우에 이런 작업을 수행했는가를 물어야만 한다. 그런데 폐기의 요점은 명백히 우위성의 문제에 관련되어 있었다. 푸코는 점차로 자신의 이전 저작들이 지각 또는 시각 방식들에 대한 언표체제의 우위성을 충분히 부각시키지 못했다고 평가하게 되었다. 이것이 현상학에 대한 푸코의 대응이다. 그러나 푸코에게 언표의 우위성이란 결코 시각적인 것의 역사적 환원 불가능성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며, 실상 그와는 정반대로 기능한다. 언표가 우위를 갖는 이유는 오직 가시적인 것이 언표의 지배요소, 즉 자기 자율성(heautonomie)과 함께 자신의 자율성과 자신의 고유한 법을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시적인 것이 자신의 고유한 형식을 언표 가능한 것에 대립시킬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언표 가능한 것의 우위성에 있다. 물론 이 고유한 형식은 오직 결정될 수 있을 뿐, 환원 가능한 것이 아니다. 푸코에게 있어 가시성의 장소들은 결코 언표들의 장과 동일한 리듬, 역사, 형식을 갖는 것이 아니다. 언표의 우위는 오직 이런 한에서만, 곧 환원 불가능한 어떤 무엇에 대해 작용하는 한에서만 가치를 갖는다. 따라서 가시성의 이론을 망각할 경우 우리는 푸코가 역사에 부여했던 개념을 단순히 훼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푸코의 사유와 이 사유에 대한 푸코의 개념화까지도 훼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푸코의 사유를 현대 분석철학의 한 변종쯤으로 취급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실상 푸코의 사유는 분석철학과는 거의 아무런 공통점도 없다. 푸코는 본 것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듣거나 읽은 것에 대해서도 끊임없는 매혹을 느꼈다. 푸코가 생각했던 고고학은 하나의 시각적-청각적 문서고였다. 푸코는 오직 자신이 보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만 언표화의 즐거움, 그리고 이런 언표들을 구분해 보는 즐거움을 누렸다. 푸코 자신을 정의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목소리이며, 또한 그만큼의 눈길이다. 눈길, 목소리(Les yeux, la voix). 푸코는 언제나 한 사람의 보는 자(voyant)이기를 결코 그치지 않았으며, 동시에 철학에 하나의 새로운 언표 스타일을 부여했다. 양자는 서로 다른 하나의 걸음, 서로에 의해 이중화되는 하나의 리듬 위에 기초해 있다.
지층화되는 것은 이후에 출현하는 어떤 지식의 간접적 대상이 아니며, 반대로 하나의 지식이 그에 따라 직접적으로 구성된다. 사물에 대한 학습과 문법에 대한 학습이 그러한 것들이다. 지층이 고고학의 문제가 되는 이유는 정확히 고고학이 반드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의 고고학 또한 존재한다. 현재든 과거든, 가시적인 것은 언표 가능한 것과 같다. 이들 모두는 현상학의 대상이 아닌, 인식론의 대상이다. 이후 푸코가 [광기의 역사]에 대해 후회한 부분은 자신이 여전히 당시의 현상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날것의 상태로 체험된 경험'(experience vecue sauvage)에 호소하거나 또는 바슐라르 식으로 '상상적인 것의 영원한 가치'(valeurs eternelles de l'imaginaire)를 옹호하고자 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실상 푸코에 의해 새롭게 개념화된 지식은 오직 매 지층, 매 역사적 형성작용에 고유한 가시적인 것과 언표 가능한 것의 조합에 의해서만 정의되기 때문에, 지식 이전에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지식은 언표들과 가시적인 것들이 빚어내는 하나의 "장치"이자, 실천적 배치이다. 따라서 지식의 배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뒤에서 살펴보게 될 것처럼 지식의 바깥에는 사물들이 있다. 결국 지식은 오직 주어진 지층에 다양한 층위와 분열 그리고 방향설정을 부여하는 무수히 다양한 "문턱들"의 기능에 의해서만 존재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단순히 특정 "인식론화의 문턱"(seuil d'epistemologisation)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불충분한 일이다. 인식론화의 문턱은 우리를 과학으로 이끌면서, "과학성"의 고유한 문턱 또는 사실상은 "형식화의 문턱"을 횡단하는 특정한 방향으로 이미 정향되어 있다. 그러나 지층들 위에는 이들뿐 아니라 윤리화(ethisation), 감성화(esthetisation), 정치화(politisation)의 문턱들처럼 다양한 방향을 향하는 또 다른 문턱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잊지 말도록 하자. 지식은 과학이 아니며, 또한 그것이 놓인 특정 문턱들과 분리 가능한 것도 아니다. 심지어 지각 경험, 상상적인 것의 가치, 시대의 이념, 또는 현금의 여론조차도 그러하다. 지식은 다양한 문턱들에 분포되어 있는 지층의 단위이다. 지층 자체 역시 오직 다양한 방향 설정 아래에 있는 이러한 문턱들의 축적으로서만 존재한다. 심지어 과학조차도 단지 이런 다양한 방향 설정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 오직 지식을 구성하는 실천들 또는 실증성들만이 존재하는데, 언표의 담론적 실천들, 가시성의 비담론적 실천들이 바로 그런 실천들이다. 그러나 이런 실천들은 언제나 역동적 재분배를 통해 지층들 사이의 역사적 차이를 구성하는 특정 고고학적 문턱들 아래에서만 존재한다. 이것이 푸코의 실증주의 또는 프래그머티즘(pragmatisme)이다. 따라서 푸코에게는 결코 과학과 문학, 또는 상상적인 것과 과학적인 것, 알려진 것과 체험된 것 사이의 관계라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푸코의 지식 개념은 각각의 문턱들을 역사적 형성작용으로서의 지층이 보여 주는 다양한 변수들로 간주함으로써, 모든 문턱들에 침투하여 그것들을 활성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말과 사물은 지식의 두 축을 묘사하기에는 너무도 막연한 개념이고, 푸코는 [말과 사물]이라는 제목이 반어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고고학의 임무는 무엇보다도 -그것이 무엇이든- 기존의 언어학적 단위, 시니피앙, 단어, 문장, 명제, 언어작용과는 전적으로 다른 '참다운 표현형식'의 발견에 있다. 푸코는 "담론이 시니피앙의 질서를 다를 경우 그 실체는 폐기된다"고 말하면서, 특히 '시니피앙' 개념을 비판한다. 우리는 이제까지 푸코가 어떻게 "언표"라는 참으로 독창적인 개념 아래 표현형식을 발견해 내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았다. 이때의 언표는 다양한 단위들을 가로지르는 기능이며, 시니피앙의 체계보다는 오히려 음악에 더 가까운 하나의 능선을 따르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마치 루셀이 자신만의 "절차"를 창조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언표를 추출해 내기 위해 단어와 문장 또는 명제를 절개하고 개방해야만 한다. 한편 내용형식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작업이 필수적이다. 표현형식이 더 이상 시니피앙이 아닌 것처럼, 이제 내용형식 또한 시니피에가 아니다. 내용형식은 어떤 사물의 상태(etat de choses) 또는 지시대상이 아니다. 가시성은 더 이상 성질, 사물, 대상 및 대상들의 조합과 같은 가시적인 요소들, 보다 일반적으로는 감각적인 요소들과 혼동되어서는 안된다. 이 점에서 푸코는 언표기능 못지않게 독창적인 또 하나의 기능을 구성해 냈다. 우리는 사물들을 절개하고 분쇄해야만 한다. 가시성은 대상형식이 아니며, 심지어는 빛과 사물의 접촉에 의해 드러나는 어떤 형식도 아니다. 가시성은 빛 자체에 의해 창조되어, 사물들 또는 대상들을 오직 반짝임, 빛남, 섬광으로만 존속시키는 밝기(luminosiite)의 한 형식이다. 이것이 푸코가 루셀로부터 이끌어 낸 두 번째 측면인데, 이는 아마도 푸코가 마네로부터도 이끌어 내고자 했던 점일 것이다. 만약 언표의 개념이 우리에게 언어학보다는 베베른의 음악적 영감에 더 가까운 개념으로 보인다면, 가시적인 것의 개념 또한 빛을 하나의 형식으로 간주하면서 그에 적절한 형식과 운동을 창조하고자 했던 들로네에 더 가까운 회화적 개념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들로네는 이렇게 말했다. 세잔은 과일바구니를 깨 버렸다. 그리고 우리는 큐비스트들처럼 그것을 다시 이어 붙이고자 시도해서는 안된다. 단어와 문장과 명제를 개방하라, 성질과 사물과 대상들을 개방하라. 고고학의 임무는 루셀의 기획처럼 이중적이다. 고고학은 단어와 랑그로부터 각각의 지층과 문턱에 대응하는 언표를 추출해야 한다. 고고학은 또한 사물과 시선으로부터 각각의 지층에 고유한 "명증성"과 가시성을 추출해야 한다.
왜 이와 같은 추출이 필요한가? 언표로부터 시작해 보자. 언표는 결코 은폐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읽을 수 있거나, 또는 심지어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때로 언표들이 종종 위장, 보류, 심지어는 억압되곤 하기 때문에, 언표들을 은폐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믿음은 단순히 우리가 단어, 문장 또는 명제에 집착하고 있는 경우에 생겨나는 '권력'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함축할 뿐이다. 푸코가 [지식의 의지] 첫 부분에서 섹슈얼리티와 관련하여 명백히 밝히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우리는 물론 빅토리아 시대에는 모든 어휘가 금지되고 문장들은 은유화되었으며 언어 역시 순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섹슈얼리티가 근본적 비밀로서 구성되었으며, 이는 단지 담대하고 저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위반자들에 의해서만 예외가 되어 왔고, 이런 사정이 프로이트가 나타나기 전까지 유지되었다고 믿을 수도 있을 것이다... .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어떤 역사적 형성 또는 지층도 이토록 수많은 조건, 체제, 장소, 계기, 대화자들을 결정하면서 섹슈얼리티의 언표들을 이렇게 증식시키는 못했다(정신분석은 이에 더하여 자신만의 고유한 방식을 덧붙이게 될 것이다). 성적 담론의 이런 증식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 우리는 트렌토 공의회 이래 '교회'가 수행했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성(le sexe)을 직접적으로 지칭하지 못하게 하는 언어 순화 작용 아래에서 성은 어떤 애매성 또는 유예도 허용치 않는 하나의 담론에 의해 구속되고 추적당한다. ...근대 사회의 고유성은 성을 어둠 속에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 성을 하나의 비밀로 취급함으로써 성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하도록 조장한다는 점이다." 간단히 말해 언표는 은폐되어 있지만, 이는 우리가 그것을 추출할 수 있는 조건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만 그러하다. 반대로 언표는 우리가 그런 조건에 도달하는 즉시, 거기에 있으며 모든 것을 말한다(il est la, et dit tout). 정치 또한 마찬가지이다. 각각의 언표체제는 단어, 문장, 명제를 교차시키는 일정한 방식을 전제로 하지만, 정치 자체는 어떤 외교, 입법, 규제, 통치 행위도 은폐하지 않는다. 물론 늘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것을 읽어 낼 수 있다. 비밀은 폭로되기 위해서, 그 자신을 폭로하기 위해서만 존재한다. 각각의 시대는 자신의 정치를 가장 냉소적인 방식으로, 또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가장 적나라한 방식으로 완전히 언표한다. 그것의 위반에서 우리가 거의 아무런 이익도 얻어 내지 못할 정도로까지 말이다. 각각의 시대는 자신의 언표 조건들에 의해 자신이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한다. [광기의 역사] 이후 푸코는 광인을 사슬로부터 해방시켰던 "박애주의"(Philanthrope) 담론을 분석했다. 그래고 푸코는 이것이 박애주의자가 광인들을 속박했던 보다 효율적인 또 하나의 감금 행위임을 숨기지 않았다. *6) 피넬과 튜크에 의한 광인들의 "해방"(liberation)은 [광기의 역사], '수용소의 탄생' 부분을 참조하라. 문제는 광인들을 지속적인 하나의 "시선" 및 "판단" 아래 굴복시키는 것이다. 18세기에 있었던 형벌의 "인도주의화"(humanisation)에 대해서는 [감시와 처벌], '일반화된 처벌' 부분을 참조하라. 사형제도 폐지의 흐름에 대해서는 [지식의 의지]를 참조하라. 문제는 더 이상 죽음의 결정이 아닌 생명의 "경영과 관리"를 일반과제로 삼는 하나의 '권력'에 처벌을 적응시키는 것이다. [프랑스의 정신의학자 피넬은 1793년 비세트르 로피탈 제네랄에서 최초로 광인들의 쇠사슬을 풀어 주었다. 영국의 퀘이커교 개혁가인 튜크는 1795년 광인들을 위한 특수시설은 요크지방에 설립했다. 이후 푸코 이전까지 그들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인도주의화'로서 이해되어 왔다.] * 매 시대마다 언제나 말해지는 모든 것들이야말로 역사를 구성하는 푸코의 가장 중요한 원칙일 것이다. 장막 뒤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다. 장막의 뒤 또는 아래에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중요한 것은 각각의 경우에 대해 그것의 장막 또는 초석을 묘사하는 일이다. 은폐된 언표가 존재한다는 반론은 단지 다양한 체제들, 조건들을 따르는 다양한 화자들과 발신자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그러나 화자와 발신자는 언표의 변수들 중 일부이며, 언표 자체를 기능으로 정의하는 여러 조건들에 엄밀히 의존한다. 간단히 말해 언표는 자신을 그런 존재로서 만드는 것, 즉 자신의 독특한 등록을 하나의 "언표적 초석" 위에서 구성하는 다양한 조건들에 관계될 경우에만 해독 가능한 것, 발화 가능한 것이 된다(우리는 이미 등록이 '드러난 것'과 '은폐되어 있는 것'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님을 살펴본 바 있다). 특정의 등록, 표현형식은 언표와 그것의 조건, 초석 또는 장막으로부터 형성된다. 언표 가능한 것이라는 조각품, 또는 언표라는 무대에 대한 푸코의 취향은 "문서들"(documents)이 아니라 "기념비들"(monuments)이다.
담론 형성작용 또는 언표의 가장 일반적인 조건은 어떤 것일까? 푸코의 답변은 그것이 언표작용의 주체를 처음부터 배제하고 있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주체는 하나의 변수, 또는 차라리 언표가 갖는 변수들의 집합이다. 주체는 어떤 본원적인 것, 곧 언표 자체로부터 파생되는 하나의 기능이다. [지식의 고고학]은 이런 주체-기능(fonction-sujet)을 분석한다. 주체는 언표의 유형 또는 문턱에 따라 변화하는 하나의 자리(place) 또는 위치(position)이다. 한편 "저자"(auteur) 자체는 특정 경우에 가능한 위치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 심지어 하나의 동일한 언표가 다수의 위치들을 점유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선적인 것은 '사람들이 말한다'(un ON PARLE)라는 하나의 사실, 익명적 중얼거림이며, 그 안에서 가능적 주체들이 배치된다. 이는 "담론의 무질서하고 끊임없는 거대한 웅성거림"이다. 푸코는 몇 번이나 되풀이하여 이 거대한 중얼거림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스스로를 그 안에 위치시키려고 했다. 푸코는 언어작용을 시작하게 만드는 기존의 세 가지 방식에 도전한다. 먼저 1) 인칭들, 심지어 언어학적 또는 연동소적(embrayeurs) 인칭들로부터 시작하는 방법이 있다. 푸코는 언어학적 인칭 체계(personnologie linguistique)에 기반한 "나는 말한다"(je parle)를 반박하면서, 이미 비인칭으로서의 3인칭이 그 이전에 존재하고 있음을 끊임없이 주장한다. 다음으로 2) 언어작용이 되돌아가는 것으로서의 우선적 방향 또는 내적 조직(organisation)으로서의 시니피앙으로부터 시작하는 방법이 있다. 푸코는 언어학적 구조주의(structuralisme linguistique)에 기반한 "그것이 말한다"(ca parle)를 반박하면서, 이미 결정된 언표들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서의 특정 집합 또는 코르퓌스가 이미 존재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3) 기원적 관계, 곧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을 기초 짓는 동시에 언표 가능한 것의 기초를 가시화하는 세계와의 우선적 공모 관계로부터 시작하는 방법이 있다. 푸코는 모든 가시적 사물들이 이미 우리의 언어작용이 택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의미를 중얼거리고 있으며, 또한 언어작용을 어떤 표현적 침묵에 의해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현상학에 기반한 "세계가 말한다"(Monde parle)를 반박하면서, 보는 것과 말하는 것 사이의 본질적 차이를 들고 있다.
언어작용은 전체로서 주어지거나, 혹은 전혀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언표의 조건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언어작용이 있다", "언어작용의 존재"또는 언어작용-존재이다. 이는 언어작용을 가능케하는 차원이지, 결코 언어작용이 되돌아가는 방향들과 혼동되어서는 안된다. "진실 또는 의미의 장소가 되면서 그것을 지적하고 명명하고 지시하고 나타나게 하는 권력을 무시하라. 그 대신 그것만의 특이하고 유한한 존재를 결정하는 (시니피앙과 시니피에의 놀이에 의해 응결되고 장악되는) 그 순간을 주목하라." 그러나 정확히 무엇이 푸코의 테제에 구체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일까? 무엇이 푸코를 현상학적 또는 언어학적 방향이 갖는 일반성에로의 함몰을 막아 주는 것일까? 무엇이 푸코로 하여금 특이하고 유한한 어떤 존재에 호소하게 만드는 것일까? 푸코의 입장은 "분포주의"(distributionalisme)와 유사한데, 푸코는 [지식의 고고학] 이후 늘 결정되어 있으며 무한하지 않은 특정의 코르퓌스로부터 출발한다. 이 특정의 코르퓌스는 특정 시대에 방사된 파롤과 텍스트, 문장과 명제로 구성되는 실로 다양한 코르퓌스이며, 푸코는 이로부터 언표적 "규칙성들"을 추출해 내고자 한다. 이제 조건 자체가 역사적이므로, 아 프리오리 역시 역사적이다(Des lors, la condition est elle-meme historique, l'a-priori est historique). 거대한 중얼거림, 달리 말하면 언어작용-존재, 또는 언어작용이 "있다"(il y a)는 각각의 역사적 형성작용에 따라 변화한다. 또한 그것은 익명적인 동시에 이러저런 양식으로부터 결코 분리할 수 없는 "수수께끼 같으며 불안정한" 것, 너무도 특이한 것이다. 각각의 시대는 자신의 코르퓌스에 의거해 언어작용을 모으는 자신만의 방식을 갖는다. 예를 들어 고전시대 언어작용의 존재가 자신이 그 틀을 그려 내는 재현작용 안에서 온전히 드러나고 있다면, 19세기는 재현의 기능을 벗어나면서 집중의 통합 기능을 상실하는 반면, 새로운 기능으로서의 문학이라는 새로운 양식 안에서 그것을 되찾고자 한다. "인간은 언어작용의 두 존재 양식 사이에서 생겨난 하나의 형상이었다. *10) 또 '언어작용의 집중'으로서의 근대 문학의 기능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 따라서 언어작용이라는 역사적 존재는 결코 이 같은 새로운 기능을 어떤 최초의 시원적 또는 단순히 매개적 의식의 내재성으로 집중시키지 않는다. 반대로 언어작용은 주어진 특정 코르퓌스의 언표들을 드러내기 위해 분포, 분산되는 하나의 외재성 형식을 구성한다. 이는 하나의 분포적 단위이다. "실증적 아 프리오리는 단순한 시간적 분산의 체계가 아니며, 그 자체로 변형 가능한 하나의 집합이다."
이제까지 우리가 언표와 그것의 조건에 대해 이야기해 왔던 모든 것은 가시성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하다. 왜냐하면 가시성 역시 은폐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볼 수 있거나 보일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가시성 자체는 우리가 대상, 사물 또는 감각적 성질에만 머무르면서 이들을 개방시키는 조건들로까지 상승하지 못하는 한 비가시적인 것으로 남아 있다. 그리하여 만약 사물들이 폐쇄되어 버린다면, 가시성들 역시 모호해지고 혼란스러워질 것이고 "명증성"도 마찬가지로 다른 시대에는 전혀 파악 불가능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또한 고전시대가 하나의 동일한 장소 안에 광인, 부랑자, 실업자를 집합시켰을 때 "지금의 우리에게는 단지 무차별적 감수성에 불과한 것이 당시의 고전시대 사람들에게는 명확히 분절되는 하나의 지각방식이었음에 틀림없다". 가시성이 연관되어 있는 조건은 그러나 어떤 주체를 보는 방식이 아니다. 보는 주체는 그 자체로 늘 가시성 안의 특정 장소이며, 가시성으로부터 파생되는 하나의 기능이다(고전주의적 재현작용에서의 왕의 위치, 또는 감옥 체제에서의 관찰자의 위치가 바로 이렇다). 이제 우리는 지각을 방향지어 주는 상상적 가치들, 또는 "지각적 주제들"을 구성하는 감각적 성질의 놀이에 호소해야 하는 것일까? 가시적인 것의 조건을 구성하는 것은 어떤 역동적 성질 또는 이미지인지도 모른다. [광기의 역사]에서 때로 푸코가 바슐라르적 방식으로 표명했던 것은 이런 점이었다. 그러나 푸코는 곧 또 다른 해결책에 이르게 된다. 예를 들어 건축물이 가시성 또는 가시성의 장소라면, 이는 건축물이 단순히 돌로 이루어진 형상을 넘어선 사물들의 배치이자 성질들의 조합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밝음과 어둠, 불투명과 투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등을 분산시키는 빛의 형식이기 때문이다. 푸코는 [말과 사물]의 유명한 장에서 벨라스케스의 그림[시녀들]을 빛의 체제(regime de lumiere)로서 묘사한다. 이 빛의 체제는 고전주의적 재현작용의 공간을 개방하면서 보이는 것과 보는 자들, 교환과 반사를 분산시켜 그림의 바깥에 있는 것으로 추론될 수 밖에 없는 왕의 장소에 도달하게 만든다(마네에 대해 쓰인 푸코의 파기된 초고는 거울의 또 다른 이용, 반사의 또 다른 분산작용과 함께 전혀 다른 빛의 체제를 묘사하지 않았던가?). [감시와 처벌]은 '판옵티콘'의 건축을 '자신은 보지 못하면서 오직 보여질 뿐인 죄수들'과 '자신은 보여지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보는 어떤 관찰자'의 배치에 의해 주변의 독방들을 비추면서, 가운데의 탑은 어두컴컴한 채로 두는 어떤 빛의 형식(forme lumineuse)으로서 묘사한다. 언표와 체제가 분리 불가능한 것처럼, 가시성과 기계 역시 분리 불가능하다. 모든 기계가 광학적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기계는 하나의 사물을 가시적으로 만들고 빛과 명증성 안에 위치 짓는 기능들, 기구들의 짜맞춤(assemblage)이다("감옥-기계", 또는 루셀의 기계들). 이미 [레몽 루셀]에서 푸코는 이에 대한 가장 일반적 형식을 수립한 바 있다. 제1의 빛(lumiere premiere)은 사물들을 개방하여 가시성들을 하나의 번갯불(eclairs), 별빛(scintillements) 또는 "제2의 빛"(lumiere seconde)으로 출현시킨다. 푸코가 [임상의학의 탄생]에 '시선의 고고학'이라는 부제를 달 수 있었던 것도 각각의 역사적인 의학적 형성작용이 이런 제1의 빛을 조정하면서 질병의 가시성에 관련된 특정 공간을 구성해 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의학적 구성은 징후들을 밝힌다. 이러한 구성은 때로는 임상의학처럼 징후들을 두 개의 차원들로 펼침에 의해, 또 때로는 병리해부학처럼 시선에는 깊이를, 질병에는 부피를 부여하는 제3의 차원을 따라 징후들을 포개어 놓음에 의해 이루어진다(생명체의 "해부"로서의 질병).
따라서 마치 언어작용-존재의 경우처럼, 하나의 빛[밝힘]이 "있다"(un "il y a" de la lumiere), 빛의 존재(etre de la lumiere) 또는 빛-존재(etre-lumiere)가 있다. 이들 각각은 절대적인 동시에 역사적인데, 왜냐하면 이들 각각은 자신이 특정한 이러저러한 형성작용 또는 코르퓌스에 스스로 부과되는 방식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들 중 하나는 가시성들을 가시적인 것 또는 지각 가능한 것으로 만들고, 다른 하나는 언표들을 언표 가능한 것, 말할 수 있는 것 또는 읽을 수 있는 거승로 만든다. 그러나 이는 가시성이 보는 주체의 행위도, 시각적 의미의 소여도 아닌 경우에 한해서만 그렇다(이제 푸코는 "시선의 고고학"이라는 부제를 폐기한다). 가시적인 것이 더 이상 어떤 감각적 성질 또는 사물에로 환원되지 않는 것처럼, 빛-존재도 더 이상 물리적 환경에로 환원되지 않는다. 결국 푸코는 뉴턴보다는 괴테에 더 가깝다. 빛-존재는 매번 가시적인 것의 조합 자체를 따름으로써 가시성을 시선에 연결시키면서 동일한 자극을 다른 의미에 연셜시키는 유일한 아프리오리인 동시에 결코 조합 자체와 엄격히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조건이다. [임상의학의 탄생]은 모든 지각경험을 지배하고 있으며 (언제나 청각 및 촉각이라는 또 다른 감각영역들과 함께 할 경우에만 호명되는) 시각을 호명하는 어떤 "절대적 시선", "잠재적 가시성", "시선 바깥의 가시성"을 이미 발견했던 것이다. 가시성들은 시각에 의해 정의되지 않는다. 가시성들을 차라리 능동과 수동, 작용과 반작용의 복합체들이며, 빛에 의해 나타나게 되는 다중-감각적 복합체들(complexes multi-sensoriels)이다. 푸코에게 보낸 마그리트의 편지에서 이야기되었던 것처럼, "보는 것, 시각적으로 묘사될 수 있는 것이 사유이다"(ce qui voit, et qui peut etre decrit visiblement, c'est la pensee).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푸코의 1차적 빛을 -자유로운 것이든 개방된 것이든, 오직 2차적인 것으로서만 우리의 시각에 드러나는- 메를로-퐁티 또는 하이데거의 '밝힘'과 연관시켜야 할까? 차이점은 두 가지이다. 우선 1)푸코의 빛-존재는 특정의 이러저런 양식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그것의 아 프리오리 역시 현상학적이기보다는 차라리 역사적, 인식론적인 것이다. 한편 2)빛-존재는 시각뿐 아니라 파롤에 대해서도 개방되어 있지 않다. 이는 언표로서의 파롤이 언어작용-존재와 그 역사적 양식들 안에서 전적으로 다른 개방의 조건을 발견해 내기 때문이다. 우리의 결론은 각각의 역사적 형성들이 가시성의 조건들 안에서 가능한 한 모든 것을 보고 또 보이게 만드는 동시에 언표 조건들의 기능에 따라 자신이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한다는 것이다. 비록 어떤 것도 직접적으로 볼 수 있거나 직접적으로 읽힐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어떤 비밀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조건들은 어떤 경우에도 특정 의식 또는 주체의 내부(l'interieur)에서 하나의 '동일자'를 구성하는 것 이상으로 통합되지 않는다. 때로는 언표들이, 때로는 가시성들이 분포, 분산되는 곳은 바로 이 외재성의 두 형식들 안에서이다. 언어작용은 단어, 문장, 명제를 "내포한다". 하지만 언어작용은 어떤 환원 불가능한 거리를 따라 분산되는 언표들을 내포하지 않는다. 언표들은 자신들의 문턱, 가족을 따라 분포된다. 마찬가지로 빛이 내포하는 것은 오직 대상들일 뿐 가시성들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푸코의 진정한 관심이 이러저런 '감금 환경'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류이다. 병원과 학교는 무엇보다도 특정한 외재성 형식 안에서 분포, 분리, 분할되는 특정 외부기능으로 되돌려지는 가시성의 장소들이다. p.87-105
표면적으로 '공통된 억압'이라는 개념은 보편적인 여성의 연대를 약속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부유한 여성과 가난한 여성, 시민과 난민, 백인 여성과 흑인 또는 갈색 인종 여성, 상류 계급 여성과 달리트 여성 할 것 없이 모든 여성은 자신의 성별로 인해 억압받으며 이 점이 여성들의 공감적, 전략적 동맹의 토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여성이 같은 피해를 보지는 않는다. 부나 인종, 시민 지위, 계급 덕분에 보호받는 여성들이 존재한다. 반면 이런 것으로 인해 고통받는 여성들도 존재하고, 이들이 가장 가혹한 피해를 받는다. 성적 억압만을 다루는 페미니즘은, 성별이 그저 자신들을 곤경에 빠뜨리는 한 원인일 뿐인 여성들에게 그다지 유용하지 않은 전략을 추구한다. 벨 훅스는 공통된 억압에 반대하는 집회의 외침이 최악의 상황에 놓인 여성들의 억압을 단순히 무시하는 수준을 넘어 보장해준다고 지적한다.
성평등을 이루기 위해 가해자를 투옥해야 한다는 접근법은 인종 같은 요인으로 복잡해질 일이 없는 '공통된 억압'의 '순수한' 사례에 해당하는 여성을 전제로 하는 경향이 있다. 성매매 범죄화가 성매매 여성에게 도움이 된다는 믿음은 그 여성에게 다른 선택권이 있다는 가정을 밑바탕에 깔고 있다. 즉 이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말하자면 빈곤이나 이민법이 아니라 성매매에 있다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투옥이 가정폭력을 근절하는 방법이라는 믿음도 가정폭력을 저지르는 남성과 공동 운명체인 여성을, 즉 자신을 구타하는 남성에게 재정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여성이나 자신과 한 공동체에 속한 남성이 경찰서나 법원, 감옥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지에 크게 영향을 받는 여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또 투옥 방식은 체포되어 감옥에 보내져 성 학대와 폭행, 굴욕, 강제 불임수술을 당하고 자녀와 떨어져야만 하는 전 세계 50만명 이상의 여성을 등한시한다. 전 세계의 투옥된 여성의 30퍼센트를 차지하는 미국에서(이에 반해 중국은 15퍼센트, 러시아는 7.5퍼센트다) 여성의 투옥률은 최근 수십년간 남성보다 두배 증가했다. 불균형적으로 치우친 여성의 빈곤은 이들이 재판 전 구류 기간에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오기 힘들고, 이는 자신의 주 보호자와 분리된 아이들의 수가 증가한다는 의미다. 미국 감옥에 수감된 여성의 80퍼센트가 자녀를 둥 엄마들이다. 여성 투옥률이 미국과 비슷한 유일한 국가인 태국에서는 여성 수감자의 80퍼센트가 폭력과 상관없는 약물 관련 범죄자다. 영국 내무부는 얄스 우드 이민자 수용소에서 단식투쟁 중인 억류자들에게 이들의 항의가 추방을 앞당길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이곳은 여성들을 무기한으로 붙잡아둘 수 있는 곳이다. 전 세계에서 투옥된 여성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했으며, 폭력에 연루된 배경을 가지고 있다. 많은 주류 페미니스트가 이들을 거의 언급하지 않는 점은 놀랍지 않다. 이는 그들 자신이 투옥 제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페미니스트들이 (경찰들이 거리를 순찰하고 남성들을 감옥에 보내는 투옥 해결책을 받아들일 때 이는 지배 계급이 범죄 대부분의 가장 심각한 원인이 되는 빈곤과 인종 지배, 국경, 계급 제도 같은 문제의 해결을 거부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요인들과 이에 따른 결과(주택과 의료 서비스, 교육, 보육,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가 여성을 더욱 불행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이들은 여성 불평등의 가장 심각한 윈인이기도 하다. 전 세계적으로 대다수 여성은 가난하고, 가장 가난한 사람은 여성이다. 이것이 '공통의 억압'에 맞서 투쟁하는 페미니즘이 모든 여성의 평등과 존엄성을 위해 싸우는 페미니즘과 다른 길을 가는 이유다. 여성에 대한 공통의 억압에 초점을 맞추는 페미니즘은 대다수 여성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요인들은 다루지 않은 채 기존의 불평등 구조에서 성평등을 이루는 방법을 찾는다. - 아미아 스리니바산, <섹스할 권리>, p.268-271
이것은 망탈리테(mentalite)의 역사도 행위(compartments)의 역사도 아니다. 말하는 것과 보는 것, 또는 차라리 언표와 가시성은 순수한 '요소들', 초월적 조건들이며, 사유가 형성되고 행동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런 '요소들' 아래 구성된 특정 순간이다. 이런 조건들에 대한 탐구가 푸코 사유의 한 특징을 이루는 일종의 신칸트주의를 구성한다. 물론 푸코와 칸트는 몇 가지 본질적 차이를 보인다. 우선 1) 푸코의 조건은 모든 가능한 경험들의 조건이 아닌 현실적 경험들의 조건이다(예를 들면 언표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특정 코르퓌스를 가정한다). 다음으로 2) 푸코의 조건은 어떤 보편적 주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 형성작용 및 "대상"에 관한 것이다(아 프리오리 자체가 역사적이다l'a-priori lui-meme est historique). 결국 3) 모든 것은 외재성의 형식들이다. 그러나 만약 푸코에게 신칸트주의적 측면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이 조건들과 더불어 가시성이 '수용성'(Receptivite)을, 언표가 '자발성'(Spontaneite)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이는 언어작용의 자발성과 빛의 수용성이라는 두 축을 구성한다. 따라서 수용성을 수동성으로, 자발성을 능동성으로 설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빛을 드러내는 작용 안에는 수동성 못지 않게 능동성도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때의 수용성을 단순한 수동성으로만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마찬가지로 자발성 또한 항상 능동성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 이때의 자발성은 차라리 수용적 형식 위에서 작동하는 어떤 "타자"(Autre)의 활동을 의미한다. 이 점에 한해서는 칸트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칸트에게 있어 "나는 생각한다"(Je pense)의 자발성은 필연적으로 이 자발성을 타자로 재현하는 수용적 존재들에 대해 작동하는데, 푸코의 경우는 이와는 전혀 다르다. 지성(l'entendement, Verstand)과 '코기토'(Cogito)의 자발성은 언어작용의 자발성(언어작용의 "있음")에, 직관의 수용성은 빛의 자발성(시-공의 새로운 형식)에 자신의 지위를 양보한다. 가시적인 것에 대한 언표의 우위는 이제 쉽게 설명될 수 있다. [지식의 고고학]은 담론 형성작용으로서의 언표에 결정적 역할을 부여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성 역시 결코 특정 결정형식으로 환원 불가능한 종류의 결정 가능성 형식으로 회귀하기 대문에, 환원 불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데카르트와 칸트 사이의 거대한 단절이다. ('나는 생각한다'라는) '결정'의 형식은 이제 -[데카르트의 경우처럼]('나는 존재한다'라는) 어떤 '결정되지 않은 것'이 아닌- ('시-공간'이라는) 순수 '결정 가능성' 형식에 연관된다. 문제는 본질적으로 다른 두 형식 및 조건 사이의 상호적응이다. 우리가 푸코에게서 발견하는 것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변형된 문제, 곧 두 "있음"의 사이, 빛과 언어작용의 사이, 결정 가능한(determinables) 가시성과 결정적(determinants) 언표 사이의 관계이다.
처음부터 푸코의 본질적 테제들 중 하나는 내용형식과 표현형식, 가시적인 것과 언표 가능한 것 사이의 본질적 차이라는 문제였다(물론 이들은 각각의 지층 및 지식을 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상호 침투하며 중첩된다). 아마도 이것이 푸코가 블랑쇼와 만나는 최초의 지점일 것이다. "말하는 것은 보는 것이 아니다"(parler, ce n'est pas voir). 그러나 블랑쇼가 결정적인 것으로서의 '말하기'의 우위를 주장하는 반면, 푸코는 블랑쇼와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결정 가능한 것으로서의 '가시성'이 갖는 환원 불가능성, 곧 '보는 것'의 특수성을 유지한다. 블랑쇼와 푸코 사이에는 비록 언표의 우위라는 공통의 전제가 존재하고 있긴 하지만, 어떤 동형성(isomorphisme) 또는 일치도 존재하지 않는다. 언표의 우위를 주장하는 [지식의 고고학]에서조차도 푸코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언표와 가시성 사이에는 어떤 상호적 인과성 또는 상징작용도 없다. 만약 언표가 어떤 대상을 갖는다 해도, 그것은 언표에 고유한 담론 대상이며, 이 대상은 시각적 대상과는 어떤 동형성도 갖지 않는다. 임상의학이 징후(symptome)와 기호(signe), 장면(spectacle)과 파롤(parole), "가시적인 것과 언표 가능한 것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구조적 동일성을 제시하고자 할 때와 같은 인식론적 꿈의 경우이든, 또는 하나의 "칼리그람"(calligramme)이 텍스트와 그림(au texte et au dessin), 언어적인 것과 조형적인 것(au linguistique et au plastique), 언표와 이미지 등에 어떤 동일한 형식을 부여하고자 할 때와 같은 심미적 꿈의 경우이든, 분명 우리는 언제나 동형성을 꿈꿀 수 있다. *18) 임상의학을 가로지르는 동형성이라는 "꿈"(reve)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임상의학의 탄생], 187-200].* 마그리트에 대한 언급에서 푸코는 텍스트와 형상, 파이프 그림과 "이것은 파이프이다"(ceci est une pipe)라는 언표를 분리시키는 "무색의 중성적인 얇고 작은 띠"가 끊임없이 재생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어떤 그림, 언표, 공통적으로 가정된 형식으로서의 '이것'도 파이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띠는 언표가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ceci n'est pas une pipe)에 이를 때까지 이들을 분리시킨다. "파이프 그림과 그것에 이름을 붙여야만 하는 텍스트가 만나는 곳은 더 이상 흑판 위, 또는 흑판의 바깥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비-관계"(non-rapport)이다. 아마도 이는 푸코가 자신의 역사 연구에서 확립한 방법 중 가장 유머러스한 사례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광기의 역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보여 준다. 광기에 연관된 가시성의 장소 또는 내용형식으로서의 로피탈 제네랄은 결코 의학에 자신의 기원을 두지 않는다. 로피탈 제네랄의 기원은 내치에 있다. 한편 "비이성"이라는 언표의 생산주체 또는 표현형식으로서의 의학은 자신의 담론체제, 진단과 처치를 로피탈 제네랄의 바깥으로까지 확장했다. 후에 푸코에 대해 언급하면서 블랑쇼는 '비이성 및 광기의 차이, 충돌'에 대해 말한다. [감시와 처벌]은 이와 인접한 주제를 심화시킨다. 범죄의 가시성으로서의 감옥은 표현형식으로서의 형법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다. 감옥은 전혀 다른 또 하나의 지평 즉 "규율적" 지평에서 나온 것이다. 감옥은 사법적 지평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형법은 감옥과는 독립적으로 "비행"이라는 언표를 생산한다. 이는 마치 형법이 언제나 일정한 방식으로 '이것은 감옥이 아니다'라고 말하게 되었던 것과도 같다. ... 이 두 형식들은 '게슈탈퉁'(Gestaltung)이라는 고고학적 의미에서의 동일한 형성작용을 갖는 것도, 동일한 발생 또는 계보학을 갖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령 어떤 마술에 의해서라도 이 둘은 만나게 된다. 우리는 이제까지 감옥이 또 다른 개인을 형사상의 비행인으로 치환하고, 그런 치환에 힘입어 비행을 생산 또는 재생산하고 있으며, 법이 죄수들을 생산 또는 재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이 양자 사이의 얽힘이 맺어지고 풀리며 또 엇갈림이 접히고 펼쳐지는 것은 늘 이러저런 지층, 이러저런 문턱 위에서이다. 그렇다면 블랑쇼와 푸코양자 모두에게 있어, 비-관계는 어땧게 해서 여전히 하나의 관계, 심지어는 보다 심원한 하나의 관계인 것일까?
우리는 여기서 "진실 놀이들"(jeux de verite) 또는 심지어는 진실의 절차들(procedures du vrai)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진실은 그것을 확립시키는 절차와 분리 불가능하다([감시와 처벌]은 중세 말 자연 과학의 모델로서의 "종교재판적 심문"과 18세기 말 인문과학의 모델로서의 "규율적 검사"를 비교한다). 그러나 하나의 절차는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아마도 그것은 대략 하나의 과정 또는 방식으로서 구성되는 프래그머티즘일 것이다. 과정이란 무엇보다도 '보는' 과정이며, 지식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일련의 질문들을 제기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러저런 문턱 또는 지층 위에서 무엇을 보는가? 우리는 지금 단순히 우리가 출발하는 대상, 우리가 추적하는 성질, 우리가 위치한 사물의 상태(지각 가능한 코르퓌스)가 어떤 것인가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질문은 오히려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어떻게 우리는 이 대상, 성질 및 사물로부터 가시성을 추출해 낼 수 있는가? 이런 가시성은 어떤 빛 아래에서 어떻게 반짝이고 빛나는가, 또한 그 빛은 어떻게 하나의 특정 지층 위에 모이게 되는가? 또한 이 가시성의 변수로 이해되는 주체의 위치는 어디인가? 무엇이 이 위치를 점유하고 또 보는가? 그러나 또한 각각의 지층에는 각기 다른 언어의 방식들이 존재하고 있다. 마치 루셀의 "절차"와 브리세의 절차가 다르듯이 말이다. 단어, 문장, 명제의 코르퓌스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이들을 가로지르는 "언표들"을 추출할 수 있는가? 이 언표들은 어떤 언어작용의 집중 방식 아래에서 언표 가족 및 문턱을 따라 분산되는가? 나아가 이때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 변수로서의 언표의 주체란 무엇이며, 또한 무엇이 주체의 위치를 채워 가는가? 간단히 말해 언표적 방식들, 그리고 기계적 과정들이 있다. 이 과정들에는 매번 진실의 문제를 구성하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다. [쾌락의 활용]이 진실은 오직 "문제화들"(problematisations)을 통해서만 지식을 창출하고, 문제화들 역시 오직 '보기의 실천들'(pratiques de voir) 및 '말하기의 실천들'(pratiques de dire)이라는 "실천들"로부터만 생겨남을 보여 주었을 때, 이 책은 이전의 모든 책들에 이어지는 하나의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었다. 과정 및 절차라는 이 실천들이 진실의 절차들, "진실에 대한 특정 역사"를 구성한다. 그러나 진실의 이 두 부분은 진실의 문제가 그들 사이의 상응성 또는 일치성을 배제하는 순간, 문제화되면서 특정한 관계를 맺게 된다. 정신의학에서 간략한 예를 들어 보기로 하자. 수용소 안에서 볼 수 있는 인간과 미친 사람이라고 언표될 수 있는 인간은 같은 사람인가? 예를 들어, '법원장' 슈레버의 편집증적(paranoiaque) 광기를 "보고" 그를 수용소에 집어넣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그의 광기를 "언표하는" 것은 훨씬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를 다시 수용소로부터 끄집어 낼 수밖에 없다. 편집광증(monomaniaque)은 반대의 경우이다. 이 경우 광기를 언표하기는 매우 쉽다. 그러나 그 광기를 제때 보고, 그를 감금해야만 할 때 실제로 그렇게 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가지 않아야 할 수많은 사람들이 수용소에 감금되었으며, 가야만 할 수많은 사람들이 수용소로 보내지지 않았다. 19세기 정신의학은 광기를 "문제화하는" 이런 특정의 관찰 위에서 생겨난 것일 뿐, 광기에 대한 어떤 분명하고 명백한 개념과는 거리가 멀었다.
참된 것은 어떤 일치 또는 공통 형식에 의해서도, 또는 위 두 형식들 사이의 어떤 대응에 의해서도 규정되지 않는다. 말하기와 보기, 가시적인 것과 언표 가능한 것 사이에는 이접이 존재한다. "우리가 보는 것은 결코 우리가 말하는 것에 거주하지 않는다."(ce qu'on voit ne se loge jamais dans ce qu'on dit) 또한 우리는 반대로도 말할 수 있다. 연접(conjonction)은 다음과 같은 이중적 이유에서 불가능하다. 언표는 자신의 고유한 상관적 대상을 가진다. 또한 언표는, 마치 논리학이 그렇듯, 결코 어떤 사물의 상태 또는 가시적 대상을 묘사하는 명제가 아니다. 가시적인 것 역시, 마치 현상학이 그렇듯, 결코 언어 안에서 현실화되는 어떤 역능의 시니피에, 무언의 의미가 아니다. 문서고, 시청각적인 것은 이접적이다. 따라서 '보기-말하기'(voir-parler)라는 이접의 가장 완벽한 예들이 영화 안에서 발견되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스트라웁 형제, 지버베르크, 뒤라스에 있어서, 목소리는 더 이상 어떤 장소도 갖지 않는 하나의 "이야기[역사]"(histoire)로서 드리워지는 반면, 가시적인 것은 더 이상 어떤"이야기"도 갖지 않는 비어 있는 장소로서 나타난다. 뒤라스의 영화 [인도의 노래]에서 목소리는 결코 보이지 않는 옛날의 무도회를 연상 또는 환기시키고 있는 반면, 시각적 이미지는 침묵이라는 또 하나의 무도회를 보여 주고 있다. 이 영화에서는 어떤 회상 장면도 시각과 일치하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어떤 화면 밖의 목소리도 청각과 일치하지 않는다. 또 다른 뒤라스의 영화 [갠지스강의 여자] 역시 "이미지의 영화와 목소리의 영화"라는 두 영화의 공존이자 이음새인 동시에, 틈새이자 유일한 "연결 요소"로서의 공백을 드러낸다. 양자 사이에는 영원한 비합리적 단절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목소리들이 어떤 이미지들 위에 존재하는가 하는 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분명, 가시적인 것에서 언표로, 또는 언표에서 가시적인 것으로 옮겨 가는 묶임(enchainement)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비합리적 단절의 위 또는 틈새 아래에서 끊임없는 되-묶임(re-enchaninement)이 이루어진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가시적인 것과 언표 가능한 것은 하나의 지층을 형성한다. 그러나 그 지층은 언제나 중심에 대한 고고학적 균열에 의해 횡단되고 구성된 것이다(스트라웁). 사물과 말에만 머무르는 한,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을 보며, 이때 양자는 서로 연계되어 있다고 믿을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물론 우리가 경험적 실천에만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말과 사물을 개방하는 순간, 우리가 언표와 가시성을 발견하는 순간, 파롤과 시각은 보다 우월한, 아 프리오리의 실천에 도달한다. 그리하여 각각은 자신을 다른 것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자신의 고유한 한계, 즉 (오직 보일 수 있을 뿐인) 가시적인 것과 (오직 말해질 수 있을 뿐인) 언표 가능한 것에 도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각각을 분리시키는 이 고유한 한계는 또한 '눈먼 파롤'과 '말 없는 영상'이라는 비대칭적인 두 측면을 가지면서 서로를 연결시켜 주는 공통적 한계이다. 푸코는 동시대의 영화와 특이할 만큼 가까이 있다.
그렇다면 비-관계는 어떻게 해서 하나의 관계인가? 또는 푸코의 다음과 같은 두 선언들 사이에는 모순이 존재하는가? 한편으로 "설령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을 말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무의미하다. 우리가 보는 것은 결코 우리가 말하는 것에 있지 않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미지, 은유, 비교에 의해 우리가 말하는 것을 보이려 한다 해도 이 역시 무의미하다. 이들이 빛나고 있는 공간은 우리의 눈에 의해 펼쳐지는 공간이 아니라, 구문의 이어짐을 정의하는 그런 공간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 "형상과 텍스트 사이에는 항상 일련의 총체적 엇갈림, 또는 차라리 서로에 대해 가해지는 공격들, 상대 과녁을 향해 쏘아진 화살들, 붕괴와 파괴를 위한 기도들, 던져지는 창들 그리고 상처, 하나의 전투가 존재한다...", "단어의 중심을 향하는 이미지의 추락, 그림에 흠집을 내는 언어의 번갯불들...", "사물의 형식 안으로 파고드는 담론들이" "존재함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며", 또한 그 역도 마찬가지이다. 이 두 종류의 텍스트들은 서로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 앞의 것은 보는 것과 말하는 것, 가시적인 것과 언표 가능한 것 사이에는 어떤 동형성 또는 상동성, 공통적 형식도 존재하지 않음을 말하고 있다. 뒤의 것은 이 두 형식들이 마치 하나의 전투처럼 서로 침투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전투에 대한 푸코의 호소는 정확히 어떤 동형성도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는 이 이질적인 두 형식들이 조건 지음(condition)과 조건 지어진 것(conditionne), 달리 말해 빛과 가시성, 언어작용과 언표를 갖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건 지음이 조건 지어지는 것을 "내포하는" 것은 아니다. 조건 지음은 조건 지어지는 것에 대해 분산의 공간을 제공하면서 스스로를 외재성의 형식으로 드러낸다. 따라서 언표는, 마치 마그리트가 그린 두 파이프들 사이의 관계처럼, 가시적인 것과 그것의 조건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간다. 따라서 언표는, 마치 마그리트가 그린 두 파이프들 사이의 관계처럼, 가시적인 것과 그것의 조건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간다. 마찬가지로 가시성은 가시적인 것과 그것의 조건 사이로 스며든다. 그리고 이는 마치 언제나 가시적인 것과 함께 할 경우에만 단어를 출현시키는 루셀과 동일하다(루셀은 마찬가지로 언제나 언표와 함께 할 경우에만 사물들을 출현시킨다). 앞서 우리는 마치 형벌의 언표들이 감옥을 강화하는 2차적인 '가시적인 것들'을 발생시키듯이 어떻게 해서 "감옥"이라는 가시성 형식이 비행이라는 행위를 갱신시키는 2차적인 '언표'를 발생시키는가를 보이고자 시도했던 바 있다. 더욱이, 바로 이 언표와 가시성이야말로 마치 투사들처럼 서로 직접 껴안고 힘을 쓰며 서로를 붙잡고 늘어지는 것이며, 이런 과정을 통해 매번 "진실"을 구성하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푸코의 공식이 있다. "하나의 동일한 운동 안에 존재하는 말하는 것과 보게 하는 것... 그것은 일련의 경이로운 조우이다." 동시에 말하고 본다는 것(비록 그것이 동일한 사물이 아니며, 우리가 보는 것 역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것 또한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지층이 구성되고, 동시에 하나의 지층에서 다른 지층에로 스스로를 변형시키는 것은 바로 이 둘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이다(물론 그것이 동일한 규칙을 따르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나 (투쟁, 구속, 전투, 이중적 침투라는) 이 첫 번째 대답은 아직 충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언표의 우위를 고려에 넣지 않은 것이다. 언표는 자신에게 규정적 형식을 부여해 주는 자기 조건(언어작용)의 자발성에 힘입어 우위를 갖는다. 반면, 가시적인 것은 단지 자기 조건(빛)의 수용성에 힘입은 결정 가능성의 형식을 가질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비록 이 두 형식들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긴 하지만, 결정작용은 언제나 언표로부터만 나오는 것임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푸코가 루셀 작품의 새로운 측면을 발견할 수 있었던 이유이다. 단순히 언표를 이끌어 내기 위해 사물들을 개방하거나, 또는 가시성들을 인도하기 위해 단어들을 개방하는 것은 중요치 않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가시적인 것에 대한 무한한 결정작용을 수행하면서 그 자발성에 따라 언표들을 싹틔우고 증식시키는 일이다. 간단히 말해, 여기에는 앞서 말한 두 형식들 사이의 관계에 관련되는 두 번째 답이 있다. 설려 언표들이 자신들이 말하는 것과는 다른 것을 보도록 만든다 하더라도, 오직 언표들만이 결정적인 것이며, 나아가 보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지식의 고고학]에서 가시적인 것이 궁극적으로 오직 '비담론적인 것'이라는 부정적 묘사로만 등장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담론적인 것이 비담론적인 것과 함께 그만큼의 더 많은 담론적 관계들을 갖게 된다는 사실에 그리 놀라지 않게 될 것이다. 가시적인 것과 언표 가능한 것 사이에서 우리는 두 형식들 사이의 이질성, 본질적 차이 또는 부동형성(anisomorphie), 그리고 상호 구속 및 포획이라는 두 형식들 사이의 상호적 전제, 마지막으로 다른 것에 대한 하나의 결정적 우위 등과 같은 다양한 측면을 동시에 유지해야만 한다. 그러나 때로는 이 두 번째 대답조차도 충분치 못하다. 만약 결정 작용이 무한히 이루어진다면, 결정 가능성이 어떻게 무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결정작용과 다른 형식을 가질 수 있는 것일까? 언표들이 가시적인 것을 무한히 결정할 때, 가시적인 것은 어째서 영원히 결정 가능한 것으로서 자신을 은폐하지 않는가? 대상의 탈주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바로 이점에서 루셀의 작품은, 실패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대양적인 의미에서 궁극적으로 죄초되는 것이 아닐까? "이곳에서 언어작용은 자신의 내부에서 원형으로 배치된다. 이때 언어작용은 자신이 보여 주어야 하는 것을 숨기며, 시선에 제공되는 것을 은폐하고, 보이지 않는 공동을 향해 현기증 나는 속도로 흘러간다. 이 텅 빈 공동에서 언어작용은 잡히지 않는 사물들을 미친듯이 좇으며 사라진다." 칸트는 이미 이와 비슷한 모험의 길을 횡단했다. 지성의 자발성은 오직 직관의 수용성이 자신의 결정 가능성 형식을 결정 작용의 형식에 끊임없이 대립시키는 경우에만, 직관의 수용성에 대해 자신의 결정 능력을 행사한다. 따라서 칸트는 이 두 형식들을 넘어서는 세 번째 심급을 도입해야만 했다. 이 세 번째 심급은 본질적으로 "신비한" 것이며, 이들 사이의 상호 적응성을 '진실;로서 설명해 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상상력의 도식이었다. 그 출현의 장소 또는 배치의 전적인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푸코의 "수수께끼 같은"(enigmatique)이란 단어는 칸트의 신비(mysterie)라는 용어에 대응된다. 그러나 푸코 역시 결정 가능성과 결정작용, 가시적인 것과 언표 가능한 것, 빛의 수용성과 언어작용의 자발성을 이 두 형식들의 저편 또는 이편에서 작동하면서 상호적응시키는 제 3의 심급을 요청한다. 푸코는 바로 이런 의미에서 구속은 적대자들이 "자신의 협박과 말을 교환하는" 하나의 거리를 함축하고 있으며, 충돌의 장소 역시 마찬가지로 적대자들이 결코 동일한 공간에 속하거나 동일한 형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님을 증언해주는 하나의 "비-장소"를 함축한다고 말한다. 마찬가지로 클레를 분석하면서 푸코는 가시적 형상과 글쓰기의 기호들은 오직 각각의 형식적 차원과는 다른 도 하나의 차원에서만 결합된다고 말한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지층과 그것의 두 형식들과는 다른 또 하나의 차원, 곧 두 형식들에 의해 지층화된 조합 및 하나에 대한 다른 하나의 우위를 설명하는 비[무]정형적인 제3의 차원으로 도약해야만 한다. 이 차원, 이 새로운 축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 p.105-121
권력이란 무엇일까? 푸코의 정의는 너무나도 단순해 보인다. 권력은 힘들의 관계[힘관계](rapport de forces)이다. 우선 권력이 하나의 형식, 예를 들면 국가형식이 아님을, 나아가 권력관계는 마치 지식처럼 어떤 두 형식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해야 한다. 두 번째로, 힘(force)이란 결코 단수가 아니며, 언제나 본질적으로 다른 힘들과의 연관 아래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모든 힘이란 이미 언제나 하나의 관계, 즉 권력(pouvoir)이다. 힘은 다른 힘들 이외의 어떤 대상 또는 주체도 갖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자연법으로의 회귀를 의미하지는 않는데, 이는 자연법이 '자연'을 하나의 가시성 형식으로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폭력이란 힘에 따르는 하나의 결과물 또는 부수적 산물이며, 결코 힘의 본질적 구성 요소가 아니다. 푸코는 힘들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폭력을 넘어서며 폭력에 의해서는 결코 정의될 수 없다고 본다는 점에서, 니체에 (그리고 또한 마르크스에) 더욱 가깝다. 이는 폭력이 스스로가 파괴하거나 변형을 가하는 어떤 특정 존재나 대상 또는 육체에 작용하는 것이 반면, 힘이란 또 다른 힘들 이외의 어떤 대상도 갖지 않는 것, 관계성 이외의 어떤 존재도 갖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힘이란 "행위에 대한 행위(une action sur l'action), 즉 현재 또는 미래의 , 현실적 또는 실제적인 모든 행위들에 대한 행위"이며, "가능한 행위들에 대해 가해지는 모든 행위들의 총체"이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행위들에 대한 행위들을 구성하면서 힘관계 또는 권력관계를 보여 주는, 그러나 필연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변수들의 일람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자극하고 유인하며 방향을 바꾸고, 어렵게 또는 쉽게 만들면서, 확장 또는 제한하며, 더 또는 덜 개연적으로 만드는 것 등등... 이런 것들이 권력의 범주들이다. [감시와 처벌]은 이런 의미에서 18세기에 힘관계가 취했던 가치들의 좀 더 세밀한 목록을 확립한 바 있다. (감금, 구획, 정돈, 연속적 배열 등으로 특화되는) 공간적 재배치(시간의 세부적 재분배, 행위의 프로그램화, 개별 행동의 분할 등의) 시간적 질서화, ("그 효과가 개별적 힘들의 총합을 넘어서는 생산적인 힘의 구성"을 위한 모든 방식 등의) 시공간적 구성 등등... 이것이 바로 이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권력에 관련된 푸코의 큰 주제들이 세 개의 항목으로 발전되는 이유이다. 권력은 ("자극하고 야기하고 생산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억압적인 것이 아니다. 권력은 (오직 계급과 같은 결정 가능한 형식 또는 국가와 같은 결정된 형식 아래에서만 소유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소유되기 이전에, 행사되는 것이다. 권력은 (관련된 모든 힘을 관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배자들 못지않게 피지배자들을 관통하는 것이다. 이는 하나의 심오한 니체주의이다.
우리는 더 이상 다음처럼 묻지 않는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가?" 다만 이제 우리는 이렇게 물을 뿐이다. 권력은 어떤 방식으로 행사되는가? 권력의 행사는 특정한 '영향력'(affect)으로서 나타나는데, 이는 힘이 그 자체로 자신의 권력에 의해(자신이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힘들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다른 힘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정의되기 때문이다. 자극, 야기, 생산은 (그리고 이와 유사한 목록의 다른 용어들도 모두 마찬가지로) 능동적 영향력을 구성한다. 반면 생산을 위해 결정, 자극, 야기된 존재는 하나의 "유용한" 효과, 즉 반작용의 영향력을 갖는다. 뒤의 것은 앞의 것에 대한 어떤 단순한 "반격" 또는 "수동적 반대급부"가 아니라, 오히려 "환원 불가능한 맞수"라 부를 만한 어떤 것이다. 이는 특히 영향을 받기만 할 뿐 저항 능력을 갖지 않는 힘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 동시에, 각각의 힘들은 (다른 힘들에 대해) 영향을 미치고, 또 (다른 힘들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양한 권력관계들을 함축하게 된다. 그리고 모든 힘들의 장은 이런 관계들 및 관련된 변양들에 관련하여 힘을 재배치한다. 자발성과 수용성은 이제 하나의 새로운 의미, 즉 '영향을 주고받음'이라는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이때 영향을 받는 권력은 마치 힘들의 질료[내용](matiere)와 같은 것이며, 영향을 주는 권력은 마치 힘들의 기능(fonction)과도 같은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다만 순수 기능, 곧 비형식화된 하나의 기능일 뿐이다. 이 기능은 자신을 구현하는 일련의 구체적 형식들, 자신이 봉사하는 목적들, 그리고 자신이 채용하는 수단들과는 무관하게 포착되는 기능이다. 그리고 이는 행위의 물리학, 곧 추상적 행위의 물리학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기능이 진입하게 될 일련의 결정된 대상들, 존재들, 및 정형화된 실체들과는 무관하게 포착되는 하나의 비정형화된 순수 질료이다. 그것은 제일 질료 또는 순수한 질료의 물리학이다. 권력의 범주는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든" 주어진 행위 및 매체에 고유한 특정의 결정작용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시와 처벌]은 '판옵티콘'을 다양한 개인들의 다수성에 대응하는 일종의 작업(tache) 또는 품행(conduite)으로 정의한다. 물론 이때의 행위는 그에 부과되는 순수한 기능에 따르는 것이다. 한편 이 다수성의 유일한 조건은 그것이 과도할 정도로 많은 숫자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 또 그 공간 역시 지나치게 광범위하지 않은 적절히 한정된 공간이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 이 경우 그 기능에 수단과 목적을 부여해 주는 (교육, 치료, 징벌, 생산 등의) 제반 형식들, 또는 기능이 수행되는 (죄수, 환자, 학생, 광인, 노동자, 병사 등의) 정형화된 실체들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과정을 통해 사실상 18세기 말의 '판옵티콘'은 모든 형식들을 관통하게 되며, 자신을 모든 종류의 실체들에 적용시키게 된다. 그것이 순수한 권력의 범주, 하나의 순수한 훈육적 기능이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이다. 따라서 푸코는 이를 다이어그램, 곧 우리가 모든 특화된 실체뿐만 아니라, "모든 특별한 용도로부터 분리시켜야만 할" 기능이라 불렀다. 이후 [지식의 의지]는 이와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또 다른 기능을 다루게 되는데, 이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생명에 대한 모든 관리 및 통제이다. 이 경우의 조건은 (인구의 문제와 같은) 무수한 다수성 및 광범위하고 열려져 있는 공간의 존재이다. 이곳이 바로 "개연적으로 만든다"라는 말이 다양한 권력 범주들 사이에서 의미를 갖게 되면서 그에 따라 일련의 개연적 방법론들이 도입되는 지점이다. 요약하면, 근대사회의 두 가지 순수 기능은 "해부정치학"(anatomo-politique)과 "생명관리정치학"(bio-politique)이고, 두 가지 순수한 질료는 모든 종류의 육체 및 인구가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서로 연계되어 있는 이 다이어그램을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이어그램은 특정 형식화에 고유한 힘관계들에 대한 설명이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권력들의 배치이자, 비형식화된 순수 기능 및 비정형화된 순수 질료의 혼합이다.
'권력'을 구성하는 힘관계 및 '지식'을 구성하는 형식적 관계의 사이에서 우리는 지식의 두 형식적 요소, 또는 형식에 대해 우리가 말했던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해야 하지 않을까? 권력과 지식 사이에는 분명한 본질적 차이 곧 이질성이 존재하지만, 이들 사이에는 또한 분명한 상호적 전제, 쌍방적 포획이 존재한다. 그러나 결국 남는 것은 지식에 대한 권력의 우위이다. 우선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는 권력이 형식들이 아닌 힘들의 사이를 관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식은 보기와 말하기, 빛과 언어작용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형식적 조건들에 의해 각각의 선분들로 재배치되는 정형화된 질료(실체들) 및 형식화된 기능에 관련된다. 따라서 지식은 상대적으로 견고한 선분성을 부여받으면서 문서화되고 지층화된다. 반면 권력은 다이어그램적이다. 권력은 지층화되지 않는 기능과 자료들을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매우 유연한 선분성을 드러내며 펼쳐진다. 실제로 권력은 형식들이 아닌, 지점들 즉 특이점들을 관통한다. 이 특이점들은 각각의 경우에 보이는 특정 힘들의 응용, 다른 힘과 연관되는 특정 힘들의 작용 및 반작용 다시 말하면 "언제나 국지적이고 불안정한 권력 상태"와 같은 특정의 영향력을 보여 준다. 이로부터 특이성의 배치, 방사라는 다이어그램의 네 번째의 정의가 나타난다. 동시에 국지적이며 불안정하고 확산적인 권력관계는 통치권의 어떤 단일한 초점 또는 중심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매 순간 다양한 변곡, 역행, 선회, 회전, 방향전환 및 저항을 보여 주면서 힘들의 장 내부를 "이 지점에서 저 지점으로" 이동한다. 바로 이런 이유로 권력관계들은 고정적 어떤 한 순간에 준하여 "국지화될 수" 없다. 권력관계들은 마치 지층화되지 않은 어떤 것의 행사처럼 하나의 전략을 구성하고, 이런 "익명적 전략들"은 가시적 또는 언표 가능한 모든 안정적 형식들을 회피하고 있으므로 거의 말하지도 보지도 못하는 어떤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이어그램이 문서고와 다른 것처럼, 전략은 지층화와 구분된다. 전략적 또는 지층화되지 않은 하나의 환경을 정의하는 것은 권력관계의 불안정성이다. 따라서 권력관계는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다. 이 부분에서도 순수하게 실천적인 결정작용은 결코 어떤 인식 또는 이론적인 결정작용으로 환원 불가능하다고 보았던 칸트와 푸코 사이의 일정한 유사성이 나타난다. 푸코에 따르면 -비록 모든 것이 실천적이라는 것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권력의 실천은 어떤 지식의 실천으로 환원 불가능한 것으로 남는다. 이런 본질적 차이를 지적하기 위해 푸코는 이후 권력이 하나의 "미시 물리학"으로 되돌려진다고 말하게 된다. 단 우리는 이때 사용된 "미시"라는 용어를 가시적 또는 언표 가능한 형식의 단순한 축소가 아닌, 하나의 새로운 영역, 하나의 새로운 관계 유형, 지식으로는 환원 불가능한 사유의 한 차원, 즉 '언제나 유동적이며 결코 국지화시킬 수 없는 관계들'에 대한 지칭으로서 이해해야만 한다. *6) "권력의 미시물리학"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감시와 처벌, 217]. 미시적인 것의 환원 불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지식의 의지 109-110]. 여기서 우리는 푸코의 사유와 피에르 부르디외의 "전략"의 사회학을 비교하고, 어떤 의미에서 후자가 미시사회학(micro-sociologie)을 구성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아마도 이 양자와 드 타르드의 미시사회학과의 비교도 마찬가지로 필요할 것이다. 드 타르드의 연구 대상은 거대집단 또는 위대한 인물들이 아니며, 마치 공무원들의 간략한 서명, 지역적인 새로운 풍습, 말실수, 쉽게 전이되는 착시 현상 등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사소한 생각이 보여 주는 희미하고도 미세한 관계들이다. 이는 푸코가 "코르퓌스"(corpus)라 지칭한 것에 연관된다. 드 타르드와 매우 유사한 '미소한 고안들'의 역할에 대한 푸코의 텍스트로는 다음을 보라.*
프랑수아 샤틀레는 푸코의 프래그머티즘을 "행사로서의 권력, 규칙으로서의 지식"(le pouvoir comme exercise, le savoir comme reglement)이라는 말로 잘 요약하고 있다. 지식의 지층화된 관계에 대한 연구는 [지식의 고고학]에서 정점에 달한다. 권력의 전략적 관계에 대한 연구는 [감시와 처벌]에서 시작되지만, 역설적이게도 [성의 역사 1, 지식의 의지]에서 정점에 달한다. 이는 권력과 지식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가 양자 사이의 쌍방적 내재성 도는 상호적 포획 및 전체를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 과학은 자신을 가능케 하는 동시에, 지식들로 하여금 일정한 인식론적 문턱을 넘나들게 하거나 하나의 인식 형성을 가능하게 해주는 권력관계와 분리될 수 없다. 예를 들면, 어떤 "성 과학"(scientia sexualis)의 경우라면 회개하는 자와 고해 신부 또는 신자와 목자 사이의 관계가, 심리학이라면 훈육적인 제반 관계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물론 인간과학이 감옥에서 도출되었다는 말이 아니다. 이는 차라리 인간과학이 감옥 자신도 의존하고 있는 힘들의 다이어그램을 전제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거꾸로 힘관계는 만약 지식을 구성하는 지층화되고 정형화된 관계 안에서 수행되지 않는다면, 추이적이며 불안정하고 사라져 가는 것, 거의 가상적인 것, 여하튼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남게 될 것이다. 심지어 '자연'에 관한 지식조차도, 그리고 특히 과학성의 문턱을 넘어서는 행위조차도, 인간들 사이의 힘관계로 돌려질 것이나, 실은 이들은 바로 이 형식 아래에서만 스스로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권력의 다이어그램으로부터 자유로운 인식주체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스스로가 실현하는 지식과의 관계로부터 자유로운 권력의 다이어그램 또한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다이어그램과 문서고를 이어 주면서, 지식과 권력 사이의 본질적 차이로부터 양자를 유기적으로 구성하는 권력-지식의 복합체에 관한 긍정이 이루어진다. 지식의 기술과 권력의 전략 사이에는, 설령 양자가 제각기 특수한 역할을 맡고 상호 간의 차이에 입각하여 서로 결부된다 할지라도, 어떠한 외재성도 없다.
권력관계들은 차이성(영향력)들을 결정하는 차이의 [미분] 관계들이다. 반면 그런 관계들을 안정화하고 지층화시키는 현실화 행위 자체는 하나의 통합작용[적분]이다. 그것은 "일반적인 힘의 선"을 추적하는 작업인 동시에, 특이성들을 연결, 결합, 동질화, 계열화, 수렴시키는 작업이다. 그러나 즉각적이며 전반적인 통합작용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존재하는 것은 그런 각각의 개별적 관계들 및 특이점들과 닮아 있는 국지적이고 부분적인 적분들이 보여 주는 특정의 다수성이다. 통합적 요소들 또는 지층화의 행위자들(agents)은 '국가'뿐 아니라 '가족', '종교', '생산', '시장', '예술' 자체 및 '도덕' 등과 같은 일련의 제도들을 구성한다. 제도는 어떤 원천 또는 본질이 아니며, 본질 또는 내재성을 갖지도 않는다. 제도는 권력을 설명해 내지 못하는 일련의 조작 메커니즘 또는 실천이다. 제도는 일련의 관계들을 전제하고, 이 관계들을 생산적이라기보다는 재생산적인 기능 아래 "고착시키는" 것에 만족하기 때문이다. '국가'란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는 것은 오직 '국가화'(etatisation)일 뿐이다. 다른 경우들 역시 이와 마찬가지이다. 이런 상황은 모든 역사적 형성작용에서 너무도 확연히 드러나는 점이며, 따라서 이제 우리는 아래와 같은 것들을 질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지층들 위에 존재하면서 각각의 제도들 위로 다시 금 되돌아오는 것은 무엇인가, 곧 제도가 통합하는 권력관계들은 어떤 것들인가? 하나의 제도는 다른 제도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 그리고 이런 재배치는 어떻게 하나의 지층으로부터 다른 지층으로 변화하는가? 다시 한번, 이는 -수평적인 동시에 수직적인- 다양한 포획의 문제를 보여 준다. 만약 우리들의 역사적 형성작용에서 국가형식이 그토록 많은 권력관계를 포착해 왔다면, 이는 권력관계가 국가로부터 파생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반대로 이는 -각각의 경우에 따르는 무척 많은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하나의 전반적 통합을 목표로 하는 "지속적인 국가화" 작용이 교육적, 법적, 경제적, 가족적, 성적 질서 안에서 끊임없이 생산되어 왔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이든 '국가'는 권력관계를 전제하는 것이지, 결코 권력의 원천이 아니다. '국가'보다 통치(gouvernement)가 더 앞서는 것이라는 푸코의 말은 바로 이런 의미이다. 물론 우리가 "통치"라는 말을 모든 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말이다(어린이, 마음, 환자, 가족... 등을 지배한다). 이로부터 우리가 ('국가' 또는 여타) 제도의 가장 일반적인 성격을 정의해보고자 한다면, 제도는 권력-통치가 가정하는 다양한 관계들의 구성작용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정된 관계들은 '국가'에 있어서는 '군주' 또는 '법', 가족에 있어서는 '아버지', 시장에 있어서는 '돈', '금' 도는 '달러', 종교에 있어서는 '신', 성적 제도에 있어서는 '성 자체' 등처럼, 몰적(molaire) 심급의 주변에 존재하는 분자적(moleculaires)또는 "미시물리학적" 관계들이다. [지식의 의지]는 이들 중 가장 두드러지는 두 사례, '법'과 '성'의 문제를 분석한다. 이 책의 결론은 어떻게 해서 "성 없는 섹슈얼리티"(sexualite sans sexe)라는 차이적 관계들이 "유일한 시니피앙이자 보편적 시니피에".섹슈얼리티의 "히스테리화"를 통해 욕망의 규범화를 수행하는 성이라는 사변적 요소 안으로 통합되는가를 보여 주는 것에 바쳐진다. 그러나 언제나, 프루스트의 경우처럼, 분자적 섹슈얼리티는 통합된 성의 밑바닥에서 끓어오르며 요동치고 있다.
이런 몰적 심급, 통합작용이 (예를 들면 "성과학"과 같은) 지식을 구성한다. 그러나 이런 층위에서 균열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푸코는 하나의 제도에는 필연적으로 "기구"와 "규칙"이라는 두 개의 극점 또는 요소가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사실상 하나의 특정 제도는 거대한 가시성 즉 '가시성의 장'및 거대한 언표 가능성, 즉 '언표의 체제'를 조직한다. 제도는 두 개의 형식 또는 표면을 갖는다. (예를 들면, 성은 동시에 말하는 것이자 보여 주는 것이다. 언어작용과 빛). 보다 일반적으로, 이곳에서도 역시 우리는 아래와 같은 이전 분석의 결론을 발견하게 된다. 통합작용은 오직 그 안에서 스스로가 분할되는 현실화의 발산(divergentes) 방식들을 창조할 경우에만, 현실화되고 또 작동한다. 더 나아가 현실화는 하나의 특정 형식적 차이화의 체계가 창조될 경우에만 통합된다. 각각의 형성작용에는 가시적인 것을 구성하는 수용성의 형식 및 언표 가능한 것을 구성하는 자발성의 형식이 존재한다. 분명 이 두 가지 형식들은 힘들의 두 측면 또는 영향력의 두 종류, 곧 영향을 받는 권력의 수용성 및 영향을 주는 권력의 자발성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두 형식은 분명 이들로부터 도출된 것이며, 이것들에서 자신의 "내적 조건"을 발견한다. 이는 권력관계가 그 자신만으로는 형식을 갖추지 못하지만, 비정형화된 질료(수용성) 및 비형식화된 기능(자발성)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지식관계는 각각의 측면에서 정형화된 실체 및 형식화된 기능을 다루는데, 이는 때로는 가시적인 것의 수용적 공간 하에서, 때로는 언표 가능한 것의 자발적 공간 하에서 이루어진다. 정형화된 실체는 가시성에 의해, 형식화되고 완성된 기능은 언표에 의해 각기 식별된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자극하다", "야기하다" 등과 같은 유형의) 영향력을 미치는 권력의 범주들, 그리고 ("교육하다", "치료하다", "징벌하다" 등과 같은) 보기와 말하기를 관통하면서 전자를 현실화시키는 지식의 형식적 범주들을 혼동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제도가 우연을 배제하는 이런 변위에 힘입어 권력관계의 통합능력을 갖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이때 제도는 권력관계를 현실화하며 수정하고 재분배하는 지식의 구성과정을 통해 이러한 작업을 수행한다. 주어진 제도의 본질, 또는 더 나아가 작동의 본질을 좇음으로써, 한편에서는 가시성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언표가 자신들을 정치적, 경제적 또는 심미적으로 만들어 줄 이러저런 문턱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물론 '가시성의 영역을 남겨 둔 채로 하나의 언표가 어떤 문턱에 -예를 들면 과학성의 문턱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가'라는 하나의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또는 그 역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진실로부터 하나의 문제가 생겨나는 방식이다. 언표들만큼이나 가변적인 '국가', 예술, 과학의 가시성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통합작용-현실화(actualisation-integration)는 어떻게 생겨나는가? [지식의 고고학]은 적어도 그런 과정의 절반에 대한 이해를 가능케 한다. 푸코는 언표의 속성으로 간주되는 "규칙성"의 개념에 호소한다. 푸코의 규칙성은 다음과 같은 매우 정확한 의미를 갖는다. 규칙성은 특이점들(규칙)을 이어 주는 곡선이다. 정확히 말해, 힘관계들은 특이점들을 결정하며, 따라서 하나의 특정 다이어그램은 언제나 특이성들의 방사이다. 그러나 특이점의 근방(voisinage)을 통과하면서, 이들 사이를 결합시키는 곡선은 이와는 전혀 다른 성질을 갖는다. 로트망은 미분[차이화]방정식 이론 내의 수학에는 '벡터 장 내의 특이점들의 존재 및 재배치' 그리고 '근방의 적분[통합] 곡선 형식'이라는 -비록 동시에 필연적으로 서로에 대해 보충적이지만- "완전히 구분되는 두 개의 실재성"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 [지식의 고고학]은 이로부터 하나의 방법론을 도출한다. 하나의 계열은 또 다른 계열이 시작되는 또 다른 특이점의 근방으로까지 연장된다. 또 다른 계열이 시작될 때, 그것은 첫 번째의 계열에 수렴되거나(같은 언표 "가족"), 또는 발산된다(다른 언표 가족). 하나의 특정 곡선이 힘관계를 규칙화하고 정렬시키면서 계열들을 수렴시키고 "일반적인 힘들의 선"을 추적하고 힘들의 관계를 실행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이다. 푸코에게는 단순히 곡선과 그래프만이 언표가 아니며, 언표 역시 곡선 또는 그래프의 하나가 된다. 푸코는 언표가 문장 또는 명제로는 결코 환원 불가능한 것임을 보다 명백히 하기 위해 내가 지금 한 장의 종이 위에 우연히 쓰고 있는 이 글자들이 하나의 언표, 곧 "오직 확률의 법칙을 따를 뿐인 알파벳의 계열이라는 언표"를 형성한다고 말한다. 마찬가지로 내가 이 프랑스어 타이프라이터의 자판에서 치고 있는 글자들은 하나의 언표인 A,Z,E,R,T를 형성한다(물론 여기에 나타난 글자들 또는 자판 자체는 가시성들이므로 결코 언표들이 아니지만). 이제 만약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푸코의 가장 어렵고 신비한 텍스트들을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첨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언표는 필연적으로 어떤 바깥, 곧 "자신과 기이하게 닮아 있고 실은 거의 동일한 것일 수도 있는 어떤 다른 것"과 특별한 연관을 갖는다. 그렇다면 이제 언표는 가시성 또는 자판 위의 글자들과 일정한 연관을 맺고 있다고 이해되어야만 할까? 물론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가시적인 것과 언표 가능한 것 사이의 연관 자체이기 때문이다. 언표는 결코 자신이 지칭하는 것 또는 의미하는 것에 의해 정의될 수 없다. 자, 아마도 다음과 같은 것이 우리가 이해해야만 하는 점일 것이다. 언표는 특이점들을 이어주는 곡선이다. 이 곡선은 힘관계를 실행하고 현실화시킨다. 이는 마치 프랑스어 자판 위의 문자들이 사용 빈도 및 근접 정도에 따라 (또는 다른 예를 들자면 우연에 따라) 글자와 손가락 사이에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특이점들 그 자체는 -그것들이 힘관계와 맺는 연관에서와 마찬가지로- 결코 하나의 언표가 아니었다. 차라리 그것들은 언표와 기이할 정도로 닮은, 거의 동일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하나의 바깥이었다. 자판 위의 글자들과 같은 가시성들은 언표에 외재적(exterieures)이지만 결코 언표의 바깥을 구성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가시성은 언표와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가시성은 자신만의 방식을 통해 이 특수한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 가시성은 도한 자신이 현실화시키는 바깥, 자신이 순차적으로 통합시키게 된느 힘관계들 또는 특이성들과도 연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가시성은 언표에 대해 외재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해결방식 또한 어떤 방식으로든 언표의 그것과는 다르다.
언표-곡선(courbe-enonce)은 영향력의 강도, 힘들의 차이화[미분] 관계, 권력의 특이성을 언어 안에서 통합한다. 그러나 가시성은 이후 이것들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즉 빛 안에서 통합해 내야 한다. 따라서 통합작용의 수용 형식인 빛은 자발성의 형식인 언어작용의 경로와 비교는 가능하지만 결코 상응하지는 않는 전적으로 다른 어떤 경로를 따라야만 한다. 그리고 "비-관계"의 한가운데 놓여 있는 이 두 형식들 사이의 관계는 불안정한 힘관계들을 확정하고, 확산 작용(diffusions)을 국지화, 전체화하며, 특이점들을 규칙화하는 양자의 두 방식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바로 이 역사적 형성작용의 빛 아래 놓여 있는 가시성들이 그림들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그림들과 가시적인 것 사이의 관계는 언표와 들을 수 있는 것 또는 읽을 수 있는 것 사이의 관계와 동일하다. "그림"은 푸코에게 거의 늘 등장하는 개념이고, 푸코는 이 단어를 종종 언표들을 포괄하는 매우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한다. 나아가 푸코가 언표에 대해 -아마도 정확한 의미에서는 언표에 속하지 않을- 보다 일반적인 기술적(descriptive) 의미를 부여했던 것은 바로 이 용어를 통해서였다. 가장 정확한 의미에서, 기술-그림(tableau-description) 및 언표-곡선은 형식화 및 통합작용의 이질적인 두 역능들이다. 이로써 푸코는 이미 오랜 역사를 갖는 하나의 논리학적 전통, 즉 -예를 들면 러셀과 같은- 언표와 기술 사이의 본질적 차이를 주장하는 전통에 속하게 된다. 최초에는 논리학에서 도출되었던 이 문제는 이후 소설, "누보로망"(nouveau roman)에서, 그리고 이후에는 영화 등의 영역에서 자신의 예상치 못했던 발전을 목도하게 된다. 이러한 푸코의 제안은 단순한 하나의 새로운 해결책 이상의 것이다. 언표-곡선이 가독성에 고유한 조절작용(regulation)인 것과 정확히 마찬가지로, 기술-그림은 가시성에 고유한 조절작용이다. 그림을 기술하려는, -또는 보다 정확하게는- 그림에 상응하는 다양한 대상에 대한 기술을 제공하려는 푸코의 열정은 바로 여기서 도출되는 것이다. [시녀들]에 대한 묘사들뿐 아니라, 마네 및 마그리트의 그림에 대한 묘사들, 그리고 죄수들의 사슬 또는 수용소, 감옥, 작은 죄수 호송 차량에 관한 묘사 등을 통해 푸코는 마치 그것들이 일련의 그림들인 양, 마치 자신이 한 사람의 화가인 양, 이들을 탁월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는 분명 푸코의 작품 전체를 일관해 흐르고 있는 누보로망 및 루셀에 대한 자신의 친연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여기에서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에 관한 기술로 돌아가 보자. 이 작품에서 광선은 특이성들을 가시적으로 만들어 주는 동시에, 그로부터 재현작용으로 가득 찬 하나의 "원" 안에 섬광과 반사광을 만들어 내는 "하나의 나선형 조개 모양"을 구성한다. 언표가 문장 또는 명제이기 이전에 곡선인 것과 꼭 같이, 그림은 윤곽선 또는 색깔이기 이전에 빛의 선이다. 한편 수용성의 이런 형식 안에서 그림이 실혀닛키는 것은 힘관계의 특이성들이며, 이때 군주와 화가의 관꼐는 "무한한 반짝임 속에 서로 교차하는" 바로 그런 것이다. 힘들의 다이어그램은 기술-그림 및 언표-곡선 안에서 동시에 실현된다.
푸코의 이런 삼각형은 심미적 분석뿐 아니라, 인식론적 분석에서도 역시 유용하다. 더욱이 가시성이 포획[작용]의 언표를 포함하고 있는 것과 꼭 같이, 언표 또한 그 자체로 포획[작용]의 가시성을 포함한다. 그렇지만 이 가시성은 단어들과 함께 작동하고 있을 때조차도 언표로부터 구분된다. 순수한 문학적 분석의 한가운데에서조차 그림과 곡선의 구분이 재발견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이다. 기술은 언어적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언표와는 구분되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마치 포크너의 작품과도 같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다. 언표는 담론적 대상 및 유동적인 주체의 위치(여러 사람을 위한 하나의 같은 이름, 한 사람을 위한 두 개의 이름)를 관통하며, 포크너에 고유한 모든 언어작용의 집합 및 언어작용-존재 안에 기입되는 환상적 곡선을 추적한다. 그러나 기술은 시간과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가시성, 섬광, 광채, 반사광을 만들어 낼 분만 아니라, 이들을 -포크너의 모든 비밀들이 간직되어 있는- 모든 빛의 집합, 빛-존재 안에 분배하는 일련의 그림들도 역시 드러낸다(포크너, 문학의 가장 위대한 "뤼미니스트"). 그리고 이 두 요소들에 덧붙여지는 세 번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알려지지도 보이지도 말해지지도 않는 권력의 초점, [미국] '남부'의 가족 안에 존재하는 전복되고 퇴폐적인 초점, 침식하는 동시에 침식되는 초점, 결국은 완전한 어둠의 생성(devenir-noir)이다.
지식에 대한 권력의 우위, 지식관계에 대한 권력관계의 우위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것은 지식관계가 만약 권력의 차이적 관계를 갖지 않는다면, 결코 자신이 통합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갖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한편 권력관계를 통합시켜 주는 작동들이 없다면 그것이 사라지는 것, 맹아적인 것 또는 가상적인 것이 되고 말리라는 점 또한 사실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상호적 전제가 성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위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것은 지식의 두 가지 이질적 형식이 통합작용에 의해서만 구성되기 때문이며, 또한 오직 힘들에 귀속되는 여러 조건들 안에서만 -그 틈새 또는 "비관계"를 넘어- 일정한 간접적 관계 안으로 진입하기 때문이다. 한편 지식의 두 형식들 사이에 존재하는 간접적 관계에는 어떤 공통 형식 또는 상응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양자 모두를 에워싸고 있는 힘들의 비형식적 요소만이 존재할 분이다. 푸코의 다이어그램론, 다시 말해 순수한 특이성들의 방사작용 또는 힘들의 순수한 관계에 대한 설명은 따라서 칸트의 도식주의(schematisme)에 대한 유비이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자발성과 수용성이라는 환원 불가능한 두 형식들 사이에서 지식이 도출되는 관계를 보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힘 자체가 그것에 고유한 자발성과 수용성을 향유하는 한 -비록 이 양자가 비형식적일지라도, 아니 오히려 비형식적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러하다. 물론 권력은, 우리가 만약 그것을 추상적으로 이해한다면, 보지도 말하지도 않는다. 권력은 오직 자신의 회랑과도 같은 그물 및 다양하게 뻗쳐 있는 자신의 땅굴 안에서만 드러나는 한 마리의 두더지이다. 권력은 "무수한 점들로부터 실행되며" "아래에서 나온다". 그러나 보다 정확히 권력은 스스로는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지만, 보고 말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파렴치한 사람들의 삶"에 관련된 푸코의 기획은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는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미 충분한 언어작용과 조명을 소유하면서 자신들의 악행에 의해 묘사되었던 유명인들의 삶이 아니다. 이 문제는 그들과 권력의 조우, 충돌이 순간적인 빛을 불러일으키고 또 말하게 만들었던 범죄적 존재, 그러나 어두컴컴하며 침묵하는 존재들에 대한 것이다. 우리는 심지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만약 지식의 배후에 마치 현상학이 바라는 것과 같은 어떤 기원적이며 자유롭고 야생적인 체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보기'(le Voir)와 '말하기'(le Parler)가 언제나 이미 자신들이 가정하고 현실화시키는 특정의 권력관계 안에 완전히 포착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언표를 추출하기 위해 문장 및 텍스트라는 코르퓌스를 결정하고자 한다면, 이는 오직 이 코르퓌스가 의존해 있는 특정한 권력(및 저항)의 초점들을 검토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것이 본질적이다. 만약 권력관계가 지식관계를 함축한다면, 마찬가지로 지식관계는 권력관계를 전제한다. 언표가 오직 외재성의 형식 안에 분산된 형태로만 존재하고, 가시성이 외재성의 또 다른 형식 안에 산포되어서만 존재하는 이유는 권력관계 자체가 더 이상 어떤 형식조차도 갖지 않는 한 요소 내에 확산되어 있는 다수의 지점들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권력관계는 언표들(그리고 가시성들)이 되돌아가는 -비록 이들이 통합장치들(integrateurs)의 지속적인 작동 때문에 실제로는 거의 구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다른 것"을 지칭한다. [지식의 고고학]에서 말하고 있듯이, 숫자들의 우연적인 방사는 언표가 아니지만, 그것의 음성적 재생산 또는 종이 위에 적어 놓은 것은 이미 하나의 언표이다. 만약 권력이 하나의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면, 그것은 단지 권력 자체가 힘들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어떤 유용한 효과를 생산, 자극, 야기하는 등의) 제반 범주들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지식과 관련하여 권력이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들고 말하게 만드는 한- 진실을 생산하기 때문이다. 권력은 문제로서의 진실을 생산한다.
이전의 연구는 우리로 하여금 푸코에 있어 매우 두드러지는 지식의 층위에 있어서의 가시적인 것과 언표 가능한 것이라는 이원론의 존재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원론이라는 말은 적어도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음이 지적되어야 한다. 1) 우선 데카르트에 있어서의 두 실체 또는 칸트에 있어서의 두 능력과도 같이 환원 불가능한 차이를 보여 주는 참다운 의미의 이원론이 있다. 2) 또한 스피노자 또는 베르그손 같이 일원론을 향해 도약하기 위한 잠정적 단계로서의 이원론이 있다. 3) 다원론의 한가운데서 작동되는 일종의 예비적 재분배로서의 이원론이 있다. 이 마지막 경우가 바로 푸코의 경우이다. 만약 가시적인 것과 언표 가능한 것이 투쟁에 돌입한다면 이는 이는 외재성, 분산작용 또는 확산의 형식으로 간주되는 각각의 형식들이 이로부터 두 종류의 "다수성" 유형을 만들어 내는 한도 내에서 그러하다. 그리고 이 두 형식들 각각은 결코 하나의 통일체로 통합될 수 없는 것들이다. 이 두 개의 다수성은 이제 세 번째의 다수성을 향해 열린다. 이는 더 이상 이원적 구분에 한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이원화 가능한 형식들로부터도 해방된 분산작용의 다수성, 힘관계의 다수성이다. [감시와 처벌]은 이 이원론들이 "다수성들" 안에 돌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몰적 효과, 또는 대량의 효과라는 점을 끊임없이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때, 영향을 주는 것-영향을 받는것(affecter-etre affecte)이라는 힘의 이원론은 단순히 힘들의 다수성, 힘의 다수적 존재 각각에 나타나는 지표에 불과하다. 지버베르크는 이원적 분할이란 단순한 하나의 형식으로 재현될 수 없는 하나의 다수성을 분배하려는 시도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분배는 오직 다수성들로부터 다수성들만을 구별해 낼 수 있을 뿐이다. 이것이 다수적인 것의 화용론이라 할 푸코 철학의 모든 것이다.
만약 가시적인 것과 언표 가능한 것이라는 두 형식 사이의 가변적 조합들이 역사적 형성작용 또는 지층을 구성하는 것이라면, 권력의 미시물리학은 반대로 비형식적인 요소 또는 지층화되지 않은 요소에 있어서의 힘관계를 드러낸다. 마찬가지로 초감각적(suprasensible) 다이어그램 또한 청각적-시각적 문서고들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다이어그램은 마치 역사적 형성이 전제하는 아 프리오리와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층들의 밑, 위 또는 심지어는 바깥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유동적이고 사라져 가는 분산된 힘관계가 지층들의 바깥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바로 지층의 바깥을 구성한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아 프리오리들이 그 자체로 역사적인 까닭이다. 일견 우리는 다이어그램을 다음의 서술처럼 근대사회에 국한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감시와 처벌]은 구시대적 군주권의 제반 효과를 사회적 장에 내재적인 분할 배치로 대체시키는 규율적 다이어그램을 분석한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지층화된 역사적 형성작용은 자신의 바깥으로서 이해되는 힘들의 다이어그램으로 되돌아간다. 우리의 규율사회는 제반 과업의 부과 또는 유용한 효과의 생산, 인구의 통제 또는 생명의 관리로 정의될 수 있는 다양한 권력의 범주들(행위에 대한 행위)을 관통한다. 인구의 통제 또는 생명의 관리로 정의될 수 있는 다양한 권력의 범주들(행위에 대한 행위)을 관통한다. 그러나 이전의 군주적 사회들 역시 결코 다이어그램적이지 않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또 다른 범주들에 의해 정의된다. 공제(제반 행위 또는 생산물들에 대한 공제 행위, 힘들에 대한 공제의 능력), 죽음의 결정("죽게 만들기 또는 살게 내버려두기", 이는 생명의 관리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각각의 경우는 그 나름의 다이어그램을 갖는다. 한편 푸코는 '국가' 사회보다는 '교회' 공동체로 귀결되는 또 하나의 다이어그램, 곧 "사목적" 다이어그램에 대해 말한 바 있다. 푸코는 이런 범주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힘관계 또는 행위에 대한 행위로서의...양떼의 방목. 우리는 그 외에도 -이후에 살펴보게 될 것처럼- 그리스적 다이어그램, 로마적 다이어그램, 봉건적 다이어그램... 등에 대해 말할 수 있다. 이 목록은 권력 범주의 목록과 마찬가지로 무한하다(물론 규율적 다이어그램은 최후의 다이어그램이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 다이어그램들이 각각의 지층들 사이에서, 아래에서 그리고 위에서 소통한다고 말할 수 있다(그리고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나폴레옹적" 다이어그램을 그것이 예고했던 새로운 규율사회와 이전의 군주적 사회 사이에 존재했던 하나의 간지층적, 매개적 다이어그램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다이어그램은 지층과 쉽게 구별된다. 오직 지층화된 형성작용만이 다이어그램 자체에는 결여된 안정성을 부여한다. 다이어그램은 그 자체로는 불안정하고 동요되어 있으며 혼합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아 프리오리의 역설적 성격, 곧 미시적 동요를 보여준다. 이는 관련된 힘들이 자신의 거리 또는 관계라는 변양들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것딜이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 힘들은 영원한 생성의 상태에 있다. 니체의 개념을 따르자면, 역사를 이중화하는, 또는 차라리 역사를 감싸는 힘들의 생성이 있다. 그러므로 힘관계들 전체를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되는 다이어그램은 어떤 장소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의 비-장소"이다. 그것은 다만 변이작용(mutations)이 일어나는 특정한 장소일 뿐이다. 갑자기 사물들은 더 이상 지각되지 않으며, 명제들 또한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언표되지 않는다... . *21) 생성, 비-장소 및 힘관계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니체, 계보학, 역사], 이광래, [미셸 푸코], 342] "갑자기" 사물들이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지각되거나 언표되지 않게 만드는 변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말과 사물, 307] 그리고 [지식의 의지, 108-109] "지식-권력관계는 주어진 분배의 형식이 아닌 '변형(transformations)의 모체'이다."* 물론 다이어그램은 자신을 안정 또는 고정시켜 주는 지층화된 형성작용들과 소통한다. 그러나 다이어그램은 또 다른 축을 따르면서 다른 다이어그램들 또는 다이어그램의 다른 불안정한 상태들과도 소통을 한다. 힘들은 이들을 횡단하면서 자신의 변이적 생성을 추구한다. 이것이 다이어그램이 언제나 지층의 바깥이 되는 이유이다. 따라서 힘관계는 오직 특이성들 및 특이점들의 방사[작용]에 의해서만 드러날 수 있다. 물론 이런 연계가 완전히 무작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는 차라리 각각은 우연적으로 작동하지만, 항상 직전의 제비뽑기에 의해 결정되는 일련의 외재적 조건들에 의해 지배되는 연속적 제비뽑기라 할 수 있다. 다이어그램 또는 다이어그램적 상태는 맘르코프의 사슬(Markov Chain)처럼 언제나 불확실성과 종속성의 혼합이다. 푸코는 "우연성의 주사위를 던지는 필연성이라는 철의 손"이라는 니체의 말을 언급한다. 딸서 존재하는 것은 연속성과 내재성을 따르는 연쇄가 아니라, 단절과 불연속성(변이작용)을 넘어서는 재-연쇄이다.
외재성(l'exteriorite)과 바깥(le dehors)은 구분되어야 한다. 외재성은 [지식의 고고학]에서 그런 것처럼 여전히 하나의 형식 또는 심지어는 서로서로에 대한 두 개의 외재적 형식들이다. 이는 지식이 빛과 언어작용, 보기와 말하기라는 두 가지 환경으로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깥은 힘에 관련된다. 만약 힘이 언제나 다른 힘들과의 관련 하에 있는 것이라면, 힘들은 필연적으로 환원 불가능한 하나의 바깥으로 귀착될 것이다. 이때의 바깥은 더 이상 형식을 갖지 않는 것이며, 하나의 힘이 다른 힘들과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소거 불가능한 일정한 거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하나의 힘이 이런 거리 또는 관계 하에서만 존재 가능한 다양한 영향력을 다른 힘과 주고받을 수 있는 것도 오직 바깥으로부터이다. 따라서 그 작동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형식의 역사와는 혼동될 수 없는 힘들의 생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모든 외재적 세계, 심지어는 모든 외재성의 형식과도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의 바깥은 이제 무한히 가까운 것이 된다. 그리고 만일 가까우면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바깥이 없었다면 두 개의 외재성 형식이 어떻게 서로에 대해 외재적일 수 있었겠는가? [지식의 고고학]은 이미 "다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리고 만약 외재적인 동시에 이질적인 지식의 두 형식적 요소가 동시에 진실 "문제"의 해결책이 되는 역사적 일치를 발견한다면, 이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힘들이 형식의 공간과는 다른 하나의 공간, 즉 정확히 말해 관계가 "비-관계"가 되고 공간이 "비-장소"가 되며 역사가 하나의 생성이 되는 "바깥"의 공간 안에서 작동하기 때문이다. 푸코의 저작들 중 니체에 대한 논문과 블랑쇼에 대한 논문을 서로 '묶임' 또는 '되-묶임'의 상태에 있다. 보기와 말하기가 외재성의 두 형식들이라면, '사유하기'는 형식을 갖지 않는 하나의 바깥에 관계된다. * 22) 블랑쇼와 만나는 두 지점은 따라서 외재성(말하기와 보기)과 바깥(사유하기)이다. 또한 외재적 형식들의 그와는 다른 차원으로서의 힘들의 바깥 즉 "또 다른 공간"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40~42]* 사유하기는 지층화되지 않은 것에 도달하는 것이다. 보기는 사유하기이고 말하기도 역시 사유하기이지만, 사유하기는 오직 보기와 말하기의 이접과 틈새 안에서만 생겨난다. 이것이 푸코와 블랑쇼의 두 번째 만남이다. 사유하기는 바깥, 이 "추상적 폭풍"이 보기와 말하기의 틈새로 흘러 들어가는 한, 바깥에 속한다. 바깥에의 호소는 푸코에게 영속적으로 등장하는 하나의 주제로, 사유하기가 어떤 능력에 본유적인 실천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유(pensee)에 이르러야만 하는 어떤 것임을 의미한다. 사유하기는 가시적인 것과 언표 가능한 것을 다시 이어 줄 수 있는 어떤 탁월한 내재성에 의존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이를 파고들며 내재적인 것을 파괴하고 절단하는 바깥의 침입 아래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바깥이 함몰되어 내재성이 도래했을 때..." 이때 내재적인 것은 "모든 것"을 만들어내고 일치시킬 수 있는 기원과 목표, 시작과 끝을 전제한다. 그러나 환경(milieux)과 사이(entre-deux)만이 존재할 때, 결코 일치하지 않는 환경을 향해 말과 사물이 열려 있을 때, 이는 바깥으로부터 오는 힘들, 오직 동요, 혼합, 수정, 변이의 상태로만 존재할 분인 힘들의 해방을 위한 것이다. 참으로 그것은 주사위 던지기인데, 이는 사유하기란 결국 주사위를 던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p.123-149
이것이 바깥의 힘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이다. 변형되는 것은 결코 역사적이고 지층화되어 있으며 고고학적인 구성물이 아니며, 다만 다른 힘들과의 관계에 진입한 힘들, 바깥으로부터 유래하는 구성적 힘(전략)들이다. 생성, 변화, 변이는 결코 구성된 형식들이 아니며, 오히려 구성적 힘들에 관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견 간단해 보이는 이 관념이 무수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인간의 죽음"이란 지점에 이르러서는 왜 그렇게도 이해되기 어려웠던 것일까? 때로 우리는 문제가 되었던 것은 존재하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단순한 하나의 개념이었다는 반론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 때로 우리는 -니체에게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푸코에게도- 위버멘쉬를 향해 스스로를 초극하는 것은 존재하는 인간이었다고 믿고 싶어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두 경우 모두는 니체는 물론 푸코에 대한 철저한 몰이해에 기반하고 있다(아직 우리는 니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푸코에 대한 주석들을 가득 채우고 있는 악의와 어리석음이라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사실상, 문제는 -그것이 개념적이든 존재하는 것이든, 지각 또는 언표 가능한 것이든- 어떤 인간적 구성물에 대한 것이 아니다. 문제는 인간의 구성적 힘들이다. 이 힘들은 어떤 다른 힘들과 함께 결합되는가? 그리고 이로부터 나오는 구성물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 고전주의 시대에 있어서 인간의 모든 힘들은 실증적 또는 무한으로까지 상승 가능한 것을 추출해 낸다고 주장되는 "재현작용"이라는 특정한 힘에 결부된다. 이렇게 해서 힘들의 집합은 '신'을 구성하지만, 인간은 구성되지 ㅇ낳는다. 한편 인간이 탄생하는 것은 오직 무한의 질서들 사이에서이다. 이것이 메를로-퐁티가 고전주의적 사유를 '무한을 사유하는 순수한 방법'에 의해 정의했던 이유이다. 이는 단지 무한이 유한에 비해 더 우선적인 것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무한에까지 이끌어 올려진 인간의 성질들이 '신'이라는 불가사의한 통일체의 구성에 봉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별한 구성물로서의 인간이 출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구성적 힘들이 재현하는 힘들을 회피하고 심지어는 파괴하는 새로운 힘들과의 관계 속으로 진입할 것이 요구된다. 이 새로운 힘들이 생명, 노동, 언어의 힘들이다. 생명은 하나의 새로운 "조직"을, 노동은 "생산"을, 그리고 언어는 "계통"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이는 이들을 재현작용의 바깥에 위치시켜 줄 것이다. 유한성의 이 어두운 히들은 처음에는 인간적인 것이 아니지만, 인간을 그 자신의 유한성으로 유도하면서, 이후 인간 자신의 것이 되어야 할 역사와 인간을 소통시키기 위해 인간적 힘들과의 관계에 다시금 진입한다. * 23) [말과 사물]에 본질적인 것은 바로 이런 점이다. 푸코는 생명, 노동, 언어가 인간이 자신의 유한성으로서 인식하고 있는 인간적 힘들이라고 말한 적이 전혀 없다. 반대로, 생명, 노동, 언어는 우선 인간에 외재적인 유한한 힘들, 인간에게 그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의 역사를 부과하는 힘들로서 출현한다. 인간이 이 역사를 전유하고 자신의 유한성에서 하나의 정초를 확립하게 되는 것을 오직 이후의 일일 뿐이다. 이런 분석의 두 계기들에 대한 푸코의 요약은 다음을 참조하라. [말과 사물, 502-504].* 이렇게, 19세기라는 새로운 역사적 형성작용에 있어 "뽑혀진"(tirees) 구성적 힘들의 집합에 의해 구성되는 것은 다름아닌 인간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세 번째 뽑기(tirage)를 상상해 본다면, 인간적 힘들은 또 한번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힘들에 관계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물은 더 이상 '신'도 인간도 아닌 무엇인가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제 인간의 죽음이 새로운 구성물의 탄생을 위한 '신'의 죽음과 서로 연계되어 있다고 말할 것이다. 간단히 말해, 바깥과 구성적 힘들의 관계는 끊임없이 새로운 구성작용에 따라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구성된 형식을 변화시킨다. 인간은 바다의 썰물과 밀물 사이의 모래사장에 그려진 하나의 얼굴이라는 [푸코의] 말은 문자 그대로 이해되어야 한다. 인간은 두 개의 타자들 사이, 곧 인간을 알지 못했던 고전주의적 과거와 여전히 그것을 알지 못할 미래 사이에서만 출현하는 하나의 특정 구성물이다. 여기에는 기뽀하거나 슬퍼할 여지가 없다. 우리는 인간의 힘들이 이미 인간의 힘들과는 다른 관계들을 구성하는 정보, "기게-인간"(homme-machine)과 같은 분리 불가능한 체계, 제3의 종인 기계들과 같은 다른 힘들과의 관계 안에 진입해있다고 항상 말해 오지 않았던가? 탄소보다는, 규소와의 새로운 결합?
하나의 힘이 다른 힘들과 영향을 주고받는 것은 항상 바깥으로부터이다. 영향을 주고받는 권력은 관련된 힘들과의 관계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된다. 힘관계의 집합을 결정하는 것으로서의 다이어그램은 결코 그 힘이 소진되지 않으며, 항상 또 다른 관계들 또는 구성들 안으로의 진입이 가능하다. 다이어그램은 바깥에서 유래하지만, 바깥은 어떤 다이어그램과도 혼동될 수 없는 것으로서 그로부터 끊임없이 새로운 다이어그램들을 "뽑아내는" 것이다. 바깥이 하나의 미래를 향해 언제나 열려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리고 이 미래에서는 어떤 것도 끝나지 않는데, 이는 어떤 것도 시작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래에서는 모든 것이 변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힘은 자신이 포착되어 있는 다이어그램과의 관계에 따르는 일정한 잠재력 또는 "저항"의 능력으로서 나타나는 제3의 권력을 소유한다. 사실, 힘들의 특정 다이어그램은 이제 차례로 지층들 위에서 변화를 가능케 하는 방식으로 수행되는 "점, 매듭, 초점"과 같은 저항의 특이성들, 권력관계에 상응하는 권력의 특이성들 곁에서 (또는 차라리 그것들과 "마주해서") 나타난다. 더욱이, 권력에 관한 마지막 명제는 권력관계들이 온전히 다이어그램 안에서 유지되는 반면, 저항은 필연적으로 다이어그램들이 유래한 바깥과 직접적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저항이 우선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특정 사회적 장은 자신의 전략화 정도보다 훨씬 더 높은 강도로 저항하며, 마찬가지로 바깥의 사유 역시 바로 그만큼 저항의 사유가 된다.
3세기 전에 몇몇 바보들은 스피노자가 인간의 자유 또는 심지어는 인간의 특별한 존재성에 대한 신념 없이도 인간의 자유를 논하는 것을 보고 놀람을 금치 못했다. 오늘날 또 다른 새로운 바보들 또는 환생한 똑같은 바보들은 인간의 죽음을 말했던 푸코가 정치적 투쟁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놀람을 금치 못한다. 푸코에 반대하는 이들은 어떤 분석으로부터도 보호되어야만 하는 인권에 대한 영원하고도 보편적인 의식을 주장한다. 물론 영원한 것에 대한 호소가 너무나도 빈약하고 피상적인 사고, 심지어 자신이 당연히 가꾸어야만 하는 것(19세기 이후 근대적 권리의 변형)에 대해서마저 너무도 무지한 사고의 가면으로 등장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푸코가 결코 보편적인 것, 영원한 것에 대해 큰 중요성을 부여한 적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단순히 이것들은 주어진 역사적 형성 또는 그런 형식화 과정 내에 존재하는 일련의 특이성들이 구성하는 특정 배치로부터 도출되는 전반적인 대량 효과에 불과하다. 보편적인 것 아래에는 특이성들의 방사작용, 놀이만이 존재할 뿐이며, 인간의 보편성(unicersalite) 또는 영원성(eternite)이란 단지 어떤 역사적 지층에 의해 유지되는 특이하고도 일시적인 조합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언표가 출현하는 동시에 보편성이 자신을 주장하게 되는 유일한 경우는 수학에서인데, 이는 이 영역에서 "형식화의 문턱"이 출현의 문턱과 교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외의 모든 곳에서, 보편적인 것은 차후에 나타나는 것이다. 푸코는 "특이성들을 개념으로까지 상승시켜 주는 로고스 운동"의 폐기를 주장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로고스는 사실상" 모든 것이 말해지고 모든 것이 죽어 버린 뒤에야 나타나는 담론, "자기 의식의 침묵하는 내재성" 안으로 돌아가 버린 담론, "이미 정돈되고" 모든 것이 완료되어 버린 "특정 담론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생성되는 것으로서의 권리[법] 주체는 특이성의 담지체, "가능성의 충만"으로서의 생명이며, 결코 영원성의 형식으로서의 인간이 아니다. 그러나 물론 인간은 '입헌'(constitutions) 정치 시대의 약동하는 힘들이 순간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구성했을 때 생명의 자리, 권리의 주체의 자리를 대신했었다. 그러나 오늘날 권리는 다시금 자신의 주체를 변화시켰는데, 그것은 심지어 인간 안에서조차도 약동하는 힘들이 새로운 조합으로 진입하여 새로운 모습을 구성해 내고 있기 때문이다. "요구되고 목표의 역할을 하는 것은 생명이다. ... 정치적 투쟁이 권리의 긍정을 가로질러 형성된다 할지라도, 그런 투쟁의 놀이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권리라기보다는 오히려 생명이다. 생명, 육체, 건강, 행복, 필요의 만족에 대한 권리... 고전주의적 법 체계의 관점에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었던 이 권리..." * 29) [지식의 의지 156-157]. 권리의 진화와 관련하여 그 인간적 대상을 개인(droit civil)보다는 오히려 생명 자체(사회적 권리droit social)로 간주하는 프랑수아 에발드의 분석은 푸코를 자신의 근거로 제시한다.*
"지식인"의 지위와 관련하여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도 이와 동일한 변이이다. 출간된 수많은 인터뷰들을 통해 푸코는 졸라와 롤랑을 거쳐 아마도 사르트르에 이르는 지식인들이 18세기에서 제2차 세계대전에 이르는 광범위한 시기 동안 '보편적인 것'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이는 작가의 특이성이 법률 전문가들에 저항할 수 있었으며, 따라서 보편성이라는 효과를 생산할 수 있었던 "법률가-명사"의 지위와 일치하는 한에서 그러했다. 만약 지식인의 모습, 글쓰기의 기능이 변화되었다면, 그것은 그것들이 차지하는 위치 자체가 변화되었기 때문이며, 이제는 한 특수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한 특이점에서 다른 특이점으로, "원자물리학자, 유전학자, 정보처리기술자, 약리학자" 등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은 어떤 특권적 교차지점, 또는 교환지점처럼 기능하면서 -더 이상 보편성이 아닌- 횡단성의 효과들을 생산한다. 이런 의미에서 지식인들 그리고 심지어는 작가들조차도 현재적 저항과 투쟁에 더욱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데(물론 이는 단순한 잠재성이다), 이는 오늘날 저항과 투쟁이 "횡단적인"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지식인 또는 작가는 권리의 언어라기보다는 생명의 언어를 말할 수 있게 되었다.
푸코는 [지식의 의지]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들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했던 것일까? 권력의 다이어그램이 규율 모델의 도입을 위해 군주 모델을 포기했을 때, 그리고 그것이 다시 인구의 "생명관리권력"(bio-pouvoir), "생명관리정치학"이 되어 생명을 책임지고 관리하게 되었을 때, 돌연 권력의 새로운 대상으로 떠오른 것은 바로 생명이었다. 이제 법은 점차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리(사형) 등과 같은 군주적 특권의 구성 요소들을 부정하게 되지만, 반면 수많은 대량 학살과 집단 학살 등은 방임하게 된다. 그리고 이는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예전 권리의 복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인종, 생존권, 생명의 조건 및 스스로를 보다 우월하다고 판단하면서 자신의 적을 더 이상 구시대적 군주권의 법적 적이 아닌 유독성, 전염성 인자, 일종의 "생물학적 위험"으로 간주하는 한 집단의 생존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다. 이후로, 인간의 죽음을 더욱더 훌륭하게 증언하면서 대량 학살이 증가하는 이유와 사형 제도가 철폐되는 경향을 보이는 이유는 "동일한" 것이다. 그러나 권력이 이렇게 생명을 자신의 대상 도는 목표로 삼을 때 권력에 대한 저항은 이미 생명을 요구하고 그것을 권력에 대립시킨다. "정치적 대상으로서의 생명은 어떤 의미에서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져 자신을 통제하고자 하는 체계에 반하는 것이 되었다." 이른바 '완성된' 담론이 말하는 바와는 반대로, 저항을 위해 인간을 요청할 필요는 전혀 없다. 저항이 이 예전의 인간에서 추출해 내는 것은 -니체가 말했던 바와 같이- 가능성의 측면에서 더 크고 더 능동적이며 더 긍정적이고 더 풍부한 생명의 힘들이다. 위버멘쉬는 결코 다음의 의미 이외의 어떤 것도 의미하지 않는다. 인간 자체가 생명을 구속하는 특정의 방식이므로 생명을 해방시켜야 하는 것은 바로 인간 자체로부터이다. 권력이 생명을 자신의 대상으로 삼을 때 생명은 권력에 대한 저항이 된다. 여기서 다시 한번, 두 가지 작동이 하나의 동일한 지평에 속하게 된다(우리는 가장 반동적인 권력들이 "생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나서는 임신중절의 문제에서 이를 다시 한번 선명히 확인한다...). 권력이 생명관리권력으로 변형된느 순간, 저항은 어떤 다이어그램의 특정한 종류, 환경 및 궤적에 한정될 수 없는 생동하는 권력(pouvoir-vital), 생명에 대한 권력이 된다. 바깥에서 오는 이 힘은 '생명'(la Vie)이라는 하나의 관념, 푸코 사유의 정점을 이루는 하나의 생기론(vitalisme)이 아닐까? 생명은 힘으로부터 나오는 이런 저항의 능력이 아닐까? [임상의학의 탄생] 이래, 푸코는 생명을 죽음에 저항하는 기능들의 집합으로서 정의하는 하나의 새로운 생기론을 창안한 공로로 비샤을 칭송해 왔다. * 31) "비샤는 죽음의 개념을 상대화시킴으로써, 분리할 수 없고 결정적이며 회복할 수 없는 사건으로 보이는 절대적인 모습을 죽음에서 제거시켰다. 비샤는 죽음의 개념을 활성화시켜, 부분적이고 점진적이며 그래서 아주 천천히 죽음으로 완성되는 모습으로 일상적인 생명 속에 재배치했다. 이런 사실로부터 그는 의학적 사고와 인식에 매우 중요한 구조를 만들었다. 생명에 반대되는 것과 스스로 드러나는 것, 생명과 진실에 대한 개념을 만든 것이다. ... 생기론(vitalisme)은 이런 죽음론(mortalisme)에 근거하고 있다."* 그리고 니체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푸코에게서도, 인간의 죽음에... 저항하는 기능들 및 힘들의 집합을 찾아야만 하는 것은 인간 자체의 안에서이다.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인간의 육체가 인간의 규율로부터 해방될 때, 그것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리고 푸코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살아 있는 것으로서" "저항하는 힘들의" 집합으로서의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른다.
주름작용, 또는 사유의 안쪽-주체화
[지식의 의지] 이후에 있었던 긴 침묵의 시기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아마도 푸코는 이 책에 대해 일종의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 푸코 스스로가 권력관계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은 아닐까? 푸코 스스로도 다음과 같은 난점을 제기한다. "자, 이제 우리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선을 넘지 못하는 무능력만을 소유한 채로 다른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 ... 권력의 측면에서 보면, 이는 권력이 말하고 또 말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동일한 선택이다... ." 물론 푸코는 이에 대해 다음처럼 스스로 답변하고 있다. "생명의 에너지가 집중되는 가장 긴장된 지점은 그것이 권력과 충돌하고 논쟁하면서 권력의 힘들을 이용하거나, 또는 그 함정들로부터 벗어나고자 시도하는 바로 이 지점이다." 한편 그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상기시킬 수도 있었을 것이다. 푸코에 따르면, 권력의 분산된 중심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보다 우선적인 저항점들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권력이 생명을 대상화할 때 그것은 반드시 자신에 대해 저항하는 하나의 생명을 드러내고 발생시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깥의 힘은 끊임없이 다이어그램들을 전복하고 전도시킨다. 그러나 반대로 만약 저항의 횡단적 관계들이 끊임없이 재-지층화되고 권력의 매듭들과 조우하며 심지어 그것들을 생산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미 1970년 이후 감옥 운동의 최종적 실패는 푸코를 상심케 만들었으며, 이어진 세계적 규모의 다른 사건들 역시 이를 더욱 깊은 것으로 만들었음에 틀림없다. 만약 권력이 진실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라면, 권력의 진실이 아닌 "진실의 권력", 권력의 적분선이 아닌 저항의 횡단선으로부터 도출되는 진실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어떻게 "선을 넘어설 " 것인가? 그리고 만약 생명을 바깥의 역능으로서 포착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이 바깥이 끔찍한 공허가 아니고, 저항하는 듯이 보이는 이 생명 또한 "부분적이고 진보적이며 완만한" 죽음의 공허 안에 존재하는 단순한 분포가 아님을 말해 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제 심지어 더 이상 죽음이 하나의 "분할 불가능하며 결정적인" 사건을 통해 생명을 운명으로 변형시킨다고 말할 수 없으며, 오히려 죽음이 생명에 특이성들을, 그리고 생명이 자신의 저항으로부터 생겨난다고 믿는 진실들을 부여하기 위해 스스로 다수화되고 차이화된다고 말해야 한다. 죽음 자체라는 거대한 한계에 앞서는 동시에 그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되는 이 모든 죽음들을 관통하는 일이 아니라면 이제 도대체 무엇이 남겠는가? 생명은 만약 그것이 "사람들은 죽는다"라는 행렬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한다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비샤가 죽음을 생명과 공존하는 것인 동시에 부분적이고 특이한 죽음의 다수성이라는 사실로 설정했으며 -바로 이와 같은 두 방식을 통해- 결정적 순간 또는 분할 불가능한 계기라는 죽음의 고전주의적 개념을 파기했다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이다. 푸코가 비샤의 논제들을 검토할 때의 어조는 그것이 단순한 인식론적 분석 이상의 것임을 잘 보여 준다. 문제는 죽음을 이해하는 것이며 푸코만큼 자신이 이해했던 죽음의 개념에 근접하게 죽은 사람은 거의 없다. 푸코는 자신에 속했던 이런 생명의 힘을 언제나 비샤적 방식의 다수적 죽음으로서 사유하고 체험했다. 그렇다면 권력을 향한 외침, 권력과의 투쟁, 권력과 "간략하고 날카로운 말들"을 교환함으로써만 자신을 드러내는 이 익명적 인물들, 그러고는 곧이어 어둠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이 생명들, 푸코가 "파렴치한 사람들의 삶"이라고 불렀으며, "그들의 불행, 그들의 분노 또는 그들의 모호한 광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존중을 요구했던 이 인물들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남겠는가. *3) 여기서 우리는 푸코가 파렴치(infamie)에 대한 두 종류의 개념을 반대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1) 하나는 바타유적 개념에 가까운 것으로, 그들의 과도함(exces)자체에 의해 전설 도는 이야기로 바뀐 인물들을 다룬다.(이는 질 드 레의 사례처럼 너무도 "잘 알려진" 고전주의적 파렴치 즉 거짓된 파렴치이다). 2) 이어지는 또 하나의 개념은 보르헤스적 개념에 가까운 것으로 여기서 하나의 인물은 전설이 되어 버리는데, 이는 그 기획의 복잡성과 우회성 및 불연속성으로 인해, 그것의 이해 가능성이 오직 모든 가능성을 완전히 소진시킬 수 있으며 심지어 모순적 사건들마저도 포괄할 수 있는 어떤 이야기의 존재 여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이는 아마도 스타비스키의 예와 같은 하나의 "바로크적" 파렴치이다). 3) 그러나 푸코는 오직 경찰의 고소장 또는 보고서에 의해서 잠시 동안만 조명을 받게 되는 하찮고 이름 없는 단순한 인물들의 파렴치, 엄밀히 말해 본다면, 희소성의 파렴치라는 자신만의 세 번째 개념을 고안해 낸다. 이는 체호프에 가까운 개념이다. * 기묘하게도 -그리고 거짓말 같지만- 푸코가 자신을 표방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 파렴치를 통해서이다. "나는 그 자체로는 너무도 작고 구별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그만큼 더 많은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는 이런 종류의 아주 작은 것들로부터 출발했다." 그리고 [쾌락의 활용]에 보이는 저 가슴을 찢는 한마디까지.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기... ."(se deprendre de soi-meme)
[지식의 의지]는 공공연한 하나의 의혹을 표명하면서 종료된다. 만약 푸코가 이 책을 마치면서 어떤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면, 이는 결코 권력에 대한 그의 사유 방식 자체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가장 파렴치한 진실 안에서 권력과 충돌할 때 권력 자체가 우리의 생명과 사유 양면에서 우리에게 부과하는 막다른 골목을 그가 발견했기 때문이다. 출구는 오직 바깥이 그것을 공허로부터 분리시켜 그것을 죽음으로부터 갈라놓는 어떤 운동에 의해 포착되었을 경우에만 가능케 될 것이다. 이는 지식의 축 및 권력의 축 양자로부터 구분되는 하나의 새로운 축으로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공정함이 쟁취되는 하나의 축? 생명의 참다운 긍정?? 어떤 경우이든 그것은 다른 축들을 무화시키는 축이 아니며, 언제나 다른 축들과 함께 작동하는 축, 다른 축들이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지 않도록 막아 주는 축이다. 아마도 이 세 번째 축은 푸코에 있어 처음부터 존재하고 있었을 것이다(지식 안에 처음부터 권력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과 독같이). 그러나 그것은 오직 거리를 취함으로써만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었고, 또 그리하여 다른 두 축들에로 되돌아올 수 있었을 것이다. 푸코는 다른 것들과 뒤섞여 있던 만큼 지각되기 어려웠던 이 길을 식별해 내기 위한 일반적 개편을 수행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는 푸코가 [쾌락의 활용]의 [서문]에서 보여 주었던 수정작업이다.
이 새로운 차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처음부터 존재해 왔던가? 이제까지 울는 3개의 차원과 조우한 바 있다. 1) 지층들 위에 존재하는 정형화되고 형식화된 관계들(지식) 2) 다이어그램의 수준에서 존재하는 힘관계들(권력). 3) 바깥과의 관계. 블랑쇼가 말하듯이 동시에 비-관계이기도 한 절대적 관계(사유). 이는 안쪽(dedans)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푸코는 내재성에 대한 급진적 비판을 멈춘 적이 없다. 그러나 마치 바깥이 어떤 외재적 세계보다 더 먼 곳에 존재하는 것처럼 어떤 내재적 세계보다 더 깊은 하나의 안쪽이 존재할 것인가? 바깥은 어떤 고정된 한계가 아니라, 하나의 안쪽을 구성하는 주름작용, 주름 및 연동 운동에 의해 활성화되는 하나의 운동하는 질료이다. 그것은 바깥이 아닌 무엇인가가 아니라, 바로 정확히 바깥의 안쪽(le dedans du dehors)이다. [말과 사물]은 바로 이 주제를 발전시킨다. 만약 사유가 바깥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또 끊임없이 바깥과 관계를 맺는 것이라면, 그리고 이 안쪽이 사유로서는 생각하지도 생각 할 수도 없는 어떤 것이라면, 어떻게 바깥이 안쪽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사유되지 않은 것(l'impense)이란 외재적인 것이 아니며, 바깥을 이중화하고 확장하는 사유 불가능성으로서 사유의 중심에 존재한다. 사유의 안쪽, 즉 사유되지 않은 것이 존재한다는 점은 이미 고전주의 시대가 무한성, 즉 무한히 다양한 질서의 존재를 언급했을 때 천명되었던 바이다. 한편 19세기 이후 그것은 차라리 바깥을 접으면서(plier), 단순히 인간이 그 안에서 거주하고 잠을 자게 될 뿐만 아니라, 반대로 그것들 역시 "살아 있는 존재, 노동하는 개인 또는 말하는 주체로서의" 눈을 뜨고 있는 인간 안에서 거주하게 될 생명, 노동, 언어의 어떤 안쪽 또는 "자기 안으로 후퇴하는 두께"와 "깊이"를 구성하게 될 유한성의 차원들이 된다. 바깥을 구부러뜨리며 안쪽을 구성하는 것은 때에 따라 무한성의 주름 또는 유한성의 겹주름들(replis)이다. 한편 [임상의학의 탄생]은 이미 어떻게 해서 임상의학이 신체를 표면으로 부상시키는 작업을 수행했는가, 또 어떻게 해서 병리해부학이 이에 따라 신체에 대하여 이전의 낡은 내재성을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바깥의 새로운 안쪽을 구성하게 될 깊은 주름작용의 작업을 도입할 수 있었던가를 보여 준 바 있다. 바깥의 작동으로서의 안쪽, 푸코는 자신의 모든 작업을 통해, 마치 배가 언제나 단순히 바다의 한 주름작용에 불과한 것첢, 단순히 바깥의 주름에 불과한 하나의 안쪽이라는 주제를 추적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배에 실려 바다로 보내졌던 르네상스 시대의 광인들과 관련하여 푸코는 이렇게 말한다. "그[광인]은 내부에서 외부로 추방된다. 그리고 바로 그것에 의해서 그는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온다. ...[광인은] 가장 자유로운 것,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열려 있는 길 가운데에서 끝이 없는 십자 교차로 위에 감금되어 있었다. 그는 탁월한 '항해자'임과 동시에 그 항해의 포로이다.
사유는 이 광인 자신 이외의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다. 블랑쇼는 푸코와 관련하여 이렇게 말한다. "바깥을 가두어 버리는 것, 이는 즉 다시 말하면 기대 또는 예외라는 내재성 안에서 바깥을 구성해 내는 것이다."
또는 차라리 언제나 푸코를 뒤쫓고 있는 주제는 이중성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중성은 결코 어떤 내재성의 투사가 아니다. 그것을 정반대로 바깥의 내재화이다. 그것은 '일자'의 분열이 아닌, '타자'의 재이중화이다. 그것은 '동일자'의 재생산(reproduction du Meme)이 아닌, '차이'의 되풀이(repetition du Different)이다. 그것은 어떤 나의 발현(emanation de'un JE)이 아닌, 언제나 다른 것 또는 '자아가 아닌 어떤 것'의 내재화 작업(mise en immanence d'un toujours autre ou d'un Non-moi)이다. 타자는 결코 재이중화 내에 존재하는 어떤 이중체(double)가 아니며, 오히려 타자의 이중체로서 살아가는 것이 자아(moi)이다. 나는 외부에 존재하지 않으며, 나는 자아 안에서 타자를 발견한다("문제는 어떻게 '타자' 즉 '멀리 있는 것'le Loitain 이 동시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le plus Proche 즉 '동일자'인가를 밝히는 것이다"). 이는 정확히 비틀기, 주름잡기, 짜집기... 등과 같은 바느질에서의 안감대기(doublure) 작업, 또는 발생학에서의 세포함입과도 같은 작용이다. [지식의 고고학]은 자신의 가장 역설적인 부분들을 통해 어떻게 하나의 문장이 다른 하나의 문장을 되풀이하는가, 어떻게 하나의 언표가 자신과 거의 식별되기 어려운 "다른 것"을 이중화하고 되풀이하는가(자판 위에서 펼쳐지는 문자들의 방사, AZERT)를 보여 주었다. 한편 마찬가지로 권력에 대한 책들은 어떻게 지층화된 형식들이 자신과 거의 식별되기 어려운 힘들의 관계를 되풀이하는가, 어떻게 역사가 생성의 '분신'(doublure)이 되는가를 보여 주었다. 이와 같은 푸코의 항구적 논제는 이미 저작 [레몽 루셀]을 통해 충분한 분석의 대상이 되었던 바 있다. 왜냐하면 루셀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바깥의 문장, 이어지는 두 번째 문장에 있어서의 그 되풀이, 이 둘 사이의 미소한 차이("흠집"accro), 하나로부터 다른 하나로의 비틀기, 주름잡기 또는 재이중화 작용이 그것이다. 흠집은 더 이상 세포의 어떤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그에 따라 외부의 세포가 비틀리고 함입되며 이중화되는 새로운 규칙이다. "임의적" 규칙 또는 우연적인 것의 방사, 주사위 던지기가 그것이다. 푸코는 이를 되풀이의 놀이, 차이의 놀이, 그리고 이들을 "이어 주는" 이중화의 놀이라고 말한다. 물론 이것이 푸코가 아마도 인식론, 언어학 및 제반 학문들에 의해 진지하게 설명될 수도 있었을 어떠한 것에 대한 문학적이며 유머러스한 소개를 수행했던 유일한 경우는 아니다. [레몽 루셀]은 어떻게 해서 안쪽이 언제나 이미 전제되어 있는 어떤 바깥의 주름작용이었는가를 밝히기 위해 '분신'이라는 단어의 모든 의미들을 접합하고 봉합시켰다. 또한 루셀의 마지막 절차, 곧 서로의 내부를 향하는 괄호치기의 증식작용이 문장 내에서의 주름작용을 다수화한다. 바로 이 부분이 푸코의 이 책이 갖는 중요성의 원천이다. 마찬가지로 푸코가 걷는 길 자체 또한 의심의 여지 없이 이중적이다. 이는 결코 우위성이 전도 가능한 것임을 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안쪽이 언제나 바깥의 분신으로 남을 것이라는 의미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한편 -마치 성급히 죽음을 찾아 나선 루셀처럼- 우리는 바깥과 그것의 "숨 막히는 공허"를 되찾기 위해 분신을 해체하고 "신중한 몸짓으로" 주름을 벌리고자 원할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 -마치 보다 현명하고 신중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무모함의 정점을 달리는 레리스처럼- 우리는 바깥으로부터 생기 있고 새롭게 태어나는 요소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 주름들을 추적하고, 흠집에서 흠집으로, 분신들을 강화하며, 하나의 "절대적 기억"을 형성하는 주름작용들에 의해 둘러싸이게 될 것이다. [광기의 역사]는 이렇게 말한다. 외부의 내부에 놓이는 것, 그리고 그 반대의 방향으로... 아마도 푸코는 이미 아주 이른 시기부터 죽음과 기억 사이의 선택이라는 말로서 정리된 이중화의 두 방식 사이를 끊임없이 왕복했던 것 같다. 아마도 푸코는 마치 루셀의 경우처럼 죽음을 선택한 것이겠지만, 그것은 결코 기억의 주름작용 또는 우회를 통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하여 아마도 심지어 푸코는 고대 그리스인들에게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야만 했을 것이다... . 바로 이런 방식을 통해 가장 정열적인 문제는 자신을 보다 냉정하고 침착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자신의 몇몇 조건들을 발견할 수 있었으리라. 만약 주름작용과 재이중화가 푸코의 모든 저작에 언제나 맴돌고 있었지만 후기에나 가서야 자신의 제자리를 찾게 된 주제들이라면, 그것은 푸코가 동시에 힘들 또는 권력관계들 및 지식의 지층화된 제 형식들에 의해서만 식별될 수 있는 이 새로운 차원을 "절대적 기억"이라 불렀기 때문이다. 고대 그리스의 [역사적] 형성작용은 낡은 제국의 형성작용과는 매우 다르며 가시적 체제로서의 그리스적 빛 및 언표적 체제로서의 로고스 안에서 현실화되는 새로운 권력관계들을 드러낸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제한된 지식의 형태를 가로지르며 확장되는 새로운 권력의 다이어그램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자기 자신의 감독을 확실히 하고, 자기 집안을 관리하며, 도시 국가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은 같은 유형의 세 가지의 실천들"인데, 크세노폰은 "이 세 가지 기술들 간의 연속성과 동형성, 그리고 이들이 한 개인의 실존 안에서 연대기적, 연속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임을 잘 보여 준다". 하지만 이것이 그리스인들의 가장 위대한 창조물은 아니다. 그리스인들의 참신성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지배를 가능케 하는 제 실천들"이 힘들의 관계로서의 권력 및 덕의 "코드"로서의 지층화된 지식 양자로부터 동시에 분리될 때 드러나는 이중적인 "벗어남"(decrochage)에 궁극적으로 기인한다. 한편에는 타인들과의 관계로부터 벗어나는 "자신에 대한 관계"(rapport a soi), 또 다른 한편에는 마찬가지로 지식의 규칙으로서의 도덕적 코드로부터 벗어나는 "자기의 구축"(constitution de soi)이 존재한다. 이런 벗어남 또는 파생물은 반드시 자기에 대한 관계가 독립적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는 마치 바깥의 관계들이 하나의 분신을 창조하고 자기에 대한 관계를 창출하며 자신의 고유한 차원을 따라 파고들며 전개되는 하나의 안쪽을 구축하기 위해, 스스로 주름 접시고 구부러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지배로서의 자기와의 관계인 "enkrateia[자제]는 자기와으이 관계가 정치, 가족, 웅변, 놀이, 덕 자체와 관련되는 '내적 규제의 원칙'이 되는 지점에 이르기까지 타인들에 대해 우리가 행사하는 권력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수행하는 하나의 권력이다"(우리가 스스로를 지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타인들을 지배하고자 바랄 수 있겠는가?). 이는 흠집과 분신의 그리스적 변용, 달리 말해 특정의 주름작용, 반성 작용을 수행하는 벗어남이다.
최소한 이것이 그리스인들의 참신성에 대한 푸코의 해석이다. 그리고 그 외관상의 사소함 또는 겸손에도 불구하고 푸코의 이런 해석은 커다란 중요성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인들이 행했던 것은 어떤 역사적, 보편적 행위를 통한 '존재'(l'Etre)의 드러냄 또는 '개현(밝힘)'(l'Ouvert, Lichtung)의 펼침이 아니다. 푸코는 그것이 그와는 다소간 다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들은 바깥을 몇몇 특정한 실천 영역 안으로 구부러뜨린다. 그리스인들은 최초의 분신이다. 힘은 바깥에 속한다. 그 이유는 힘이 본질적으로 다른 힘들과의 관계이자, 다른 힘들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권력(자발성) 및 다른 힘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권력(수용성)과 그 자체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이로부터 도출되는 것은 자기와 힘(force)의 관계, 자기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력(pouvoir), 자기에 의해 행해지는 자기에의 영향력(affect)이다. 그리스적 다이어그램에 따르면, 오직 자유인들만이 다른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다("자유로운 행위자들" 및 그들 사이의 "투쟁적 관계"가 이 다이어그램의 특징이다). * 17)그리스인들에 고유한 권력관계 또는 힘의 다이어그램은 푸코에 의해 직접적으로 분석된 적이 없다. 그는 이런 작업이 데티엔, 베르낭, 비달-나케와 같은 현대의 사가들에 의해 이미 적절히 수행되었던 것으로 평가했을 것이다. 그들의 독창성은 그리스인들의 정신적, 물리적 공간을 권력관계의 새로운 유형이라는 입장에서 정확히 정의한 것에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푸코가 끊임없이 언급하고 있는 "투쟁적" 관계가 하나의 고유한 기능이라는 점을 밝혀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는 특히 사랑에 관련된 행위를 통해 잘 드러난다).* 그러나 자신들 스스로를 지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타인들을 지배할 수 있는가? 타인들에 대한 지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지배에 의해 이중화되어야 한다. 타인들과의 관계는 자신과의 관계를 통해 이중화되어야 한다. 권력의 의무적 규칙들은 그것을 수행하는 자유인의 임의적 규칙들에 의해 이중화되어야 한다. 자신의 내부에 존재하는 코드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으며 이로부터 풀려난 하나의 "주체"는 (도시, 가족, 법정, 놀이 등) 도처에서 다이어그램을 실행하는 여타의 도덕적 코드들로부터도 역시 벗어나야만 한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인들이 행했던 것이다. 그들은 힘을 여전히 힘으로 유지시키면서도 그것을 접을 수 있었다. 그들은 힘을 힘 자체로 되돌렸다. 그들은 내재성, 개인성, 주체성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주체, 즉 "주체화"의 생산물이자 파생물로서의 주체를 발명해 냈다. 그들은 "심미적 실존" 즉 자유인의 임의적 규칙, 자기와의 관계, 분신을 발견했다. *18) 어떤 하나의 코드로 환원시킬 수 없는 것으로서의 "주체화"(subjectification) 또는 주체의 구축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쾌락의 활용], 43~48, 심미적 실존의 영역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같은 책, 123~126. "임의적 규칙"이란 용어는 푸코가 아닌 라보프의 것으로 이 용어는 항수가 아닌 내적 변수의 기능에 대한 묘사를 위한 언표의 지위에 관련해서는 완전히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이 용어는 코드와는 구별되는 규제적 기능을 지칭하는 보다 일반적 의미를 획득한다.* (만약 우리가 이런 파생물을 하나의 새로운 차원으로서 간주하지 않는다면, 또한 특히 우리가 주체성을 의무적 규칙의 측면에서 찾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인들에게는 주체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게 될 것이다. ...) 푸코의 근본적 사유는 권력과 지식으로부터 파생되지만 그것들에 의존하지는 않는 주체성의 차원이라는 관념이다.
또한 [쾌락의 활용]은 이전의 책들과 비교해 볼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차이를 보여 주는 책이다. 한편으로 이 책은 이전의 저작들이 17~19세기에 이르는 짧은 시기를 다루었던 것에 반해 그리스인들로부터 시작되어 그리스도교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는 긴 시기를 다루고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이 책은 이전 저작들의 탐구 대상이 되었던 지식관계 및 권력관계로 환원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으로서의 '자기와의 관계'를 발견했다. 따라서 전체적인 재조직화가 요청된다. 결국 권력과 지식이라는 이중적 관점에서 섹슈얼리티를 탐구했던 [지식의 의지]와의 단절이 존재하게 된다. 자기와의 관계는 이미 발견되었지만 그것과 섹슈얼리티의 관계는 여전히 불분명한 채로 남아 있다.* 20) 푸코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우선 섹슈얼리티에 관한 책을, 그리고 후에도 같은 노선에 입각해서 [지식의 의지]를 쓰기 시작했으며, "그러고 나서는 섹슈얼리티가 사라진 자아와 자아의 테크닉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는 또 다른 책을 통해 전자와 후자 사이의 평형을 유지하려 해야만 했습니다".* 전체적 재조직화를 위한 첫걸음은 이미 내딛어졌다. "섹슈얼리티의 역사"라는 기획의 쇄신이라는 측면에서, 자기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서 섹슈얼리티와의 선택적 연계를 가질 수 있는가? 대답은 매우 엄격한 것이다. 권력관계가 오직 실행됨으로써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것과 똑같이, 그것을 펼쳐 내는 자기와의 관계도 실행됨으로써만 자신을 확립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확립 또는 실행되는 것은 섹슈얼리티에서이다. 그리고 아마도 이 관계는 직접적인 것은 아닐 것인데, 이는 하나의 안쪽, 내재성을 구성하는 것은 섹슈얼리티와 관계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우선 양생(alimentation)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한번 섹슈얼리티가 점차적으로 양생으로부터 "벗어나" 자기와의 관꼐를 실행하는 장소가 되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인들에 의해 체험된 것으로서의 섹슈얼리티는 여성적인 것으로서 힘의 수용적 요소를, 남성적인 것으로서 힘의 능동적 또는 자발적 요소를 탄생시켰다. 이후로 자기 결정(auto-determination)으로서의 자유인의 자기와의 관계는 다음의 세 방식으로 섹슈얼리티에 관련될 것이다. 1)쾌락의 "양생술"(Dietetique)이라는 단순한 형식을 통해 자신의 육체를 적극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자기를 통제한다. 2) 가정의 "경제"(Economie)라는 복합적 형식을 통해 배우자를 통제하여 그녀 스스로가 탁월한 수용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자기를 통제한다. 3) 소년들의 "연애술"(Erotique)이라는 분열된 형식을 통해 소년들 또한 그들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 또한 타인들의 권력에 대해 저항하며 스스로 능동적이기 위해 자기를 통제한다. 그리스인들은 자기와의 관계를 고안한 것에 그치지 않고 또한 그것을 섹슈얼리티에 연결, 결합, 분열시켰다. 간단히 말해 이는 그리스인들에 의해 섹슈얼리티와 자기와의 관계 사이에 확립된 하나의 견고한 조우이다.
재분배 또는 재조직화는 적어도 장기 지속의 관점에서는 스스로 형성된다. 이는 자기와의 관계가 더 이상 자유인을 위해 남겨진 한정된 구역 즉 모든 "제도적, 사회적 체계"로부터 독립적인 구역으로서 남아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와의 관계는 권력관계 및 지식관계 안에 포섭될 것이다. 그것은 자신이 처음에 파생되었던 이 체계들 안으로 재통합될 것이다. 내재적 개인은 하나의 "도덕적" 지식 안에서 코드화되고 재코드화되며, 무엇보다도 권력의 쟁점이 되면서 다이어그램화된다. 이제 주름은 펼쳐진 것으로서 나타나게 되고, 지유인의 주체화는 예속(assujettissement)으로 변형된다. 이는 한편으로 모든 개별화(individualisation) 및 조정(modulation)의 과정을 수반하는 "통제와 의존에 의한 타인에의 복종"이다. 이 모든 과정은 권력이 이후 주체들이라 부르게 될 사람들의 내면 및 일상생활에 작용하는 과정에서 권력 스스로가 창출해 내는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이는 이후 주체의 지식을 형성하게 될 인간 및 도덕에 관한 제반 학문의 모든 기술들을 수반하는 "자기 인식 및 의식에 읜한 자기 고유한 정체성에의 집착"이다. *24) 여기서 우리느 푸코의 다양한 지표들을 다음처럼 요약해 본다. 1) 도덕은 주체화의 코드와 양식이라는 두 개의 극점을 갖는데 이 두 극점들은 서로 반비례한다. 하나가 확장되면 나머지 하나는 반드시 축소된다. 2) 주체화는 하나의 코드로 되돌아가는 경향을 가지며 코드를 위해 소멸되거나 경화되기도 한다(이는 [자기 배려]의 일반적 논점 중 하나이다). 3) 내재성에 침투하여 개별화를 담당하는 권력의 새로운 유형이 나타난다. 이는 최초에는 교회의 사목적 권력이었다가 이후 국가 권력에 의해 취합된다.* 동시에, 섹슈얼리티는 권력 초점의 주위에 조직되면서 "성 과학"을 발생시키고 '성'(le Sexe)이라는 "권력-지식"의 심급 안으로 통합된다(푸코는 여기서 [지식의 의지]의 분석으로 돌아간다).
이제 그리스인들에 의해 천착되었던 하나의 새로운 차원은 사라져 지식과 권력이라는 두 축으로 축소되어 버렸다고 결론지어야 하는가?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자유로운 개별성으로서의 자기와의 관계를 되찾기 위해 그리스인들에게로 되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물론 이는 잘못된 것이다. 코드와 권력에 저항하는 자기와의 관계는 언제까지나 존속될 것이다. 심지어 자기와의 관계는 앞서 우리가 언급했던 이 저항점의 기원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만약 우리가 '종교개혁' 이전까지 끊임없이 전개되었던 주체화의 "정신적 금욕적 운동"에 대한 고려 없이(다양한 집단적 주체화의 방식들이 존재했다) 그리스도교의 도덕을 그것이 조작하는 단순한 코드화 작업 또는 그에 따르는 사목적 권력으로 환원시켜 버린다면 이는 그릇된 일이 될 것이다. 심지어 후자가 전자에 저항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치 못한데 이는 양자 사이에는 언제나 -[상호적] 구성이든 또는 투쟁이든- 일정한 지속적 교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만 한다. 주체화 즉 자기와의 관계는 그리스적 양식이 아주 오랜 기억으로서 남게 되는 그런 지점까지 스스로를 변형시키고 자신의 양식을 바꾸어 가면서 근임없이 생산되고 있다. 권력관계 및 지식관계에 의해 다시금 포착된 자기와의 관계는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방식을 통해 끊임없이 다시 태어나고 있다.
자기와의 관계의 가장 일반적 공식은 다음과 같다. 자기에 의한 자기의 영향력, 또는 주름 접힌 힘(l'affect de soi par soi, ou la force pliee). 주체화는 주름작용에 의해 생산된다. 마치 지옥의 강들철머 오직 네 가지 주름작용, 네 가지 주체화의 주름만이 존재한다. 1) 첫 번째 주름작용은 이후 주름 안에 포착되어 둘러싸이게 되는 우리 자신의 물질적 부분에 관련된다. 그리스인들에게 있어 이는 육체(corps)와 그 쾌락(plasir), "아프로디지아"(aphrodisia) 였지만, 그리스도교인들에게 있어 그것은 살(chair)과 그 욕망(desir) 즉 이전의 것과는 전혀 다른 실체적 양식으로서의 욕망이 될 것이다. 2) 두 번째 주름작용은 엄밀히 말해 힘들 관계의 주름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힘들의 관계가 자기와의 관계에 속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의 특이한 규칙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때 작용하는 규칙이 자연적 또는 신적, 함리적, 심미적인가 등등에 따라 전혀 달라진다. 3) 세 번째 주름작용은 지식의 주름이다. 이는 진실한 것과 우리 존재, 그리고 우리 존재와 진실의 연결을 구성하는 것으로서의 진실의 주름인데 이 연결이 모든 지식과 인식에 형식적 조건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처럼 지식의 주체화는 그리스인들, 그리스도교인들, 플라톤, 데카르트 또는 칸트에 있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4) 네 번째 주름작용은 바깥 자체의 주름 즉 궁극이다. 블랑쇼가 "기대의 내재성"(interiorite d'attente)이라 불렀던 것을 구성하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 주체가 다양한 양식을 통해 불멸성, 영원성, 구원, 자유, 죽음, 초연함 등등을 기대하는 것은 바로 이로부터이다. 네 가지 주름작용들은 마치 자기와의 관계로서의 내재성 또는 주체성이 갖는 목적인(cause finale), 형상인(cause formelle), 작용인(cause efficiente), 질료인(cause materielle)과도 같은 것이다. *26) 푸코에 의해 구별된 네 측면을 체계화해 보자. 푸코는 주체 구성의 두 번째 측면을 기술하기 위해 "예속화"(assujettissement)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따라서 이 단어는 구성된 주체가 권력관계에 복종하는 경우 이외의 의미를 도한 갖는다. 세 번째 측면은 특별한 중요성을 가지며 [말과 사물]과의 연관을 가능케 한다. 사실상, [말과 사물]은 어떻게 해서 생명, 노동, 언어가, 보다 심오한 주체성의 구성을 위해 접혀지기(se plier) 이전에, 무엇보다도 지식의 대상이 되었는가를 보여 주고 있다.* 이 주름들은 무엇보다도 다양한 리듬을 갖는 명백히 가변적인 성질을 가지며 그 변양들 또한 주체화의 환원 불가능한 제반 양식들을 구성한다. 이 주름들은 지식과 권력의 "제반 코드와 규칙 아래에서" 작동한다. 또한 주름들은 종종 스스로 펼쳐지면서 이들과 다시 결합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항상 또 다른 접힘들(pliures)이 함께 형성된다.
또 각각의 경우에 자기와의 관계는 주체화 양식에 상응하는 하나의 양상에 따라 섹슈얼리티와 조우하도록 결정되어 있다. 이는 힘의 자발성과 수용성이 그리스인들의 경우처럼 더 이상 능동적 역할 및 수동적 역할에 따라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교인들의 경우처럼 전혀 다른 하나의 양성적 구조를 따라 분배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전반적 대조라는 관점에서 그리스인들의 육체와 쾌락 및 그리스도교인들의 살과 욕망이 보여 주는 차이점들은 무엇인가? 플라톤은 첫 번째 주름에서는 육체와 쾌락에 머물러 있지만 이미 세 번째 주름에서 연인을 향해 진실을 되접고 (더 이상 어떤 쾌락의 주체가 아닌) 하나의 "욕망하는 주체"에 이르게 될 새로운 주체화의 과정을 되찾으면서 '욕망'에로 상승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현재적 양식, 우리 자신의 근대적 자기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무어라 말하게 될 것인가? 우리의 네 가지 주름작용들은 무엇인가? 만약 권력이 점차로 우리의 일상생활, 내재성, 개별성을 포위해 가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만약 권력이 개별화의 과정을 통해 스스로를 생산해 낸다면, 만약 지식 자체가 욕망하는 주체의 코드화 및 해석학을 형성하면서 점차로 개별화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주체성에는 무엇이 남겠는가? 이제 주체에게는 전혀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을 것인데 이는 주체가 마치 지식을 주체화하고 권력을 휘어지게 만드는 주름들의 방향 설정을 따르는 하나의 저항점처럼 매번 새로이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근대적 주체성은 '법'(la Loi)에 지나치게 예속되어 있는 욕망에 대항하여 육체와 그 쾌락을 되찾을 것인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그리스인들로의 회귀가 아닌데, 이는 [푸코에게 있어] 회귀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28) [지식의 의지]는 육체와 그 쾌락, 즉 "성 없는 섹슈얼리티"(sexualite sans sexe)가 법에 욕망을 접합시키는 "성"(le Sexe)의 심급에 "저항하는" 근대적 방식임을 이미 보여 주었다. 그러나 이는 단지 매우 부분적이고 애매한 의미에서의 그리스인들로의 회귀일 뿐인데, 이는 육체와 그 쾌락이 그리스인들을 자유인들 사이의 투쟁적 관계들, 즉 여성들이 배제된 하나의 단성적 "성년 남성 사회"로 회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는 명백히 우리의 사회적 영역에 고유한 관계 유형과는 전혀 다른 하나의 유형을 추적하고 있다. 잘못된 회귀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에 실린 푸코의 텍스트를 참조하라.* 근대적 주체성을 위한 투쟁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현실적 형식을 갖는 예속에 대한 저항을 통과한다. 첫 번째는 권력의 제반 요구들에 따라 우리의 개별화를 구성하는 예속의 형식이며, 두 번째는 각각의 개인을 이미 잘 알려지고 인식되어 있으며 언제나 이미 항상 결정되어 있는 하나의 정체성에로 결합시키는 예속의 형식이다. 주체성을 향한 투쟁은 따라서 차이를 향한 권리, 변형 및 변신을 위한 권리로서 드러난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들을 복수화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푸코의] 미완성 수고인 [살의 고백] 그리고 심지어는 이를 넘어 푸코 탐구의 마지막 관심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쾌락의 활용]에서 푸코는 주체를 드러내지 않는다. 사실상, 푸코는 이미 주체를 하나의 파생물, 즉 언표로부터 파생된 하나의 기능으로서 정의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주체를 주름이라는 조건 아래에서 생겨나는 바깥의 파생물로서 정의하면서 푸코는 주체의 의미를 확장하는 동시에 그것에 하나의 환원 불가능한 차원을 부여한다. 우리는 이제 다음과 같은 가장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한 기초적 요소들을 확보했다. 더 이상 권력도 지식도 아닌 이 자기와의 관계, 이 새로운 차원을 무엇이라 부를 것인가? 자기에 의한 자기에의 영향은 쾌락인가 또는 욕망인가? 또는 차라리 쾌락 또는 욕망의 행위처럼 "개인적 행위"(conduite individuelle)라 불러야 하는가? 이에 대한 정확한 용어는 오직 우리가 이 세 번쨰 차원이 장기 지속의 관점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런 지점을 확인할 경우에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바깥의 주름작용이 출현한 것은 서양의(occidentales) 형성작용에 고유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오리엔트'(l'Orient)는 그런 형상을 보이고 있지 않으며 바깥의 선 또한 숨 막히는 진공을 가로질러 부유하는 채로 남아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고행은 이제 어떤 특별한 주체성의 생산도 가져오지 못한 채 진공 속에서 숨을 쉬고자 하는 하나의 노력, 무화의 문화가 되어 버릴 것이다. * 30) 푸코는 자신이 오리엔트적(orientales) 형성작용을 다룰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우리[서양]의 '성 과학'(scientia sexualis)[이는 [지식의 의지]에서 다루어진다] 또는 그리스인들의 심미적 실존과는 구분되는 '중국인들'의 "성애술"(ars erotica)에 대한 간략한 언급을 행하고 있을 뿐이다. 문제는 다음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오리엔트적 기법(techniques orientales)에는 하나의 주체화 과정 또는 어떤 '자기'(Soi)가 존재하는가? [들뢰즈는 여기서 '오리엔트'와 '중국'을 동일시하고 있다. 이는 들뢰즈의 무의식을 잘 보여 주는 사례인데, 푸코는 이런 동일시를 행한 적이 없다.]* 어떤 힘을 복종시키기 위한 조건은 자유인들 즉 그리스인들 사이의 투쟁적 관계와 함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힘이 다른 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향하여 되접히는 곳도 바로 여기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주체화 과정의 시초를 그리스인들에게서 찾는다 해도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런 과정이 적용되는 방식은 여전히 장기 지속이라는 관점이다. 푸코가 변이의 장소로서의 권력의 다이어그램 및 지식의 문서고에 대한 단기 지속의 관점을 갖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런 연대기는 무척이나 특기할 만한 것이다. *31) 푸코는 [지식의 고고학]에서 인식론적 지속이 필연적으로 단기적임을 보여 준 바 있다.* [쾌락의 활용]과 함꼐 등장하는 장기 지속의 이런 갑작스런 도입의 이유에 대한 가장 단순한 답변은 아마도 다음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실행되지 않는 낡은 권력들,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은 낡은 지식들은 금방 잊어버린다. 그러나 도덕적 문제에 있어 우리는 여전히 우리 스스로도 더 이상 믿지 않는 낡은 신념들로 스스로를 가득 채우고 우리의 문제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은 낡은 양식들에 따라 우리를 주체로서 생산한다. 한편 이것은 안토니오니로 하여금 이렇게 말하게 만들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는 '에로스' 때문에 앓고 있다. ... 모든 것은 마치 주체화의 양식들이 긴 생명을 지니기라도 한 것처럼 일어나고, 우리는 여전히 ~로의 회귀라는 우리의 취향에 맞추어 마치 그리스인들, 그리스도교인들처럼 행세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심오한 하나의 실증적인 이유가 있다. 그것은 주름작용 자체, 재이중화가 하나의 '기억'(Memoire)이라는 점이다. 그것은 지층 및 문서고에 기입되는 단기적 기억 및 여전히 다이어그램들에 포획되어 있는 잔존물들 모두를 넘어서는 "절대적 기억" 또는 바깥의 기억이다. 이미 그리스인들의 심미적 실존은 본질적으로 미래의 기억을 촉진시켰으며 주체화 과정 도한 참다운 기억들 즉 "히폼네마타"(hypomnemata)로 구성되는 글쓰기에 의해 대단히 빠른 속도로 수행되었다. 기억은 자기와의 관계 또는 자기에 대한 자기의 영향력에 대한 참다운 이름이다. 칸트에 따르면 -마치 공간이 그 아래에서 정신이 다른 사물에 의해 영향을 받는 형식인 것과 꼭 같이 -시간은 그 아래에서 정신이 스스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형식이었다. 따라서 시간은 주체성의 본질적 구조를 구성하는 "자기 영향력[정동]"(auto-affection)이다. 그러나 주체 또는 차라리 주체화로서의 시간은 기억이라 불린다. 이런 단기적 기억은 사후적으로 나타나 망각에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이중화하고 바깥을 재이중화하면서 망각과 하나가 되는 "절대적 기억"이다. 왜냐하면 절대적 기억은 자기 자체이며 또한 재창조되기 위해 끊임없이 망각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그것의 주름은 펼침과 뒤섞이는데 이는 펼침이 주름 접힌 것으로서의 주름 안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오직 망각(펼침)만이 기억 안에서(주름 자체 안에서) 주름 접힌 것을 되 찾게 된다. 한편 푸코에 의한 하이데거의 궁극적 재발견이 있다. 기억에 반하는 것은 망각이 아니라, 우리를 바깥으로 용해시키며 죽음을 구성하는 망각의 망각이다. 반대로 바깥이 주름 접히는 한 마치 기억이 망각과 동일한 외연을 갖는 것처럼 안쪽은 바깥과 동일한 외연을 갖는다. 생명, 장기지속이란 바로 이 '동일한 외연을 가짐'(coextensivite)이다. 시간은 이제 주체가 되는데 이는 그것의 바깥의 주름작용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이런 식으로 시간은 모든 현재를 망각 속으로 밀어 넣지만 동시에 모든 과거를 기억 안에 보존한다. 회귀 불가능성으로서의 망각, 되풀이의 필연성으로서의 기억. 오랫동안 푸코는 바깥을 시간보다 더 깊은 하나의 궁극적 공간성으로서 간주했다. 푸코는 자신의 마지막 저작들에서 시간을 바깥에 위치시킬 수 있는 가능성, 주름이 존재한다는 조건 아래 바깥을 시간으로서 사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시금 부여한다. *34) 최초로 시간에 대한 공간의 우위를 부여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은 [말과 사물]에 나타난 외재성 및 '바깥'이라는 주제들이었다.*
푸코와 하이데거의 필연적 대립이 발생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주름'은 여전히 푸코의 작품들에 나타나고 있지만 그것이 자신의 참다운 차원을 발견하는 것은 연구의 마지막 단계에서이다. 푸코와 하이데거의 유사점 그리고 차이점은 무엇인가? 우리는 오직 푸코가 행했던 단절, 곧 "천박한" 의미의 현상학 즉 지향성(intentionnalite)과의 단절을 출발점으로 삼을 경우에만 그것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다. 의식이 사물을 겨냥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의미를 창출한다는 점을 푸코는 거부한다. 사실상 지향성은 모든 종류의 심리학주의와 자연주의를 거부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나 -메를로-퐁티 자신이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것이 "학습"(learning)과 거의 구별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현상학은 또 다른 종류의 새로운 심리학주의, 자연주의를 만들어 낸다. 현상학은 의식과 의미 작용의 종합이라는 하나의 심리학주의, "야생적 체험"(experience sauvage), 사물,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의 '있게 내버려둠'(laisser-etre)이라는 하나의 자연주의를 복원한다. 바로 여기에서 푸코의 이중적 이의 제기가 기인한다. 확실히 우리가 단어와 문장의 수준에 머무는 한 우리는 의식이 어떤 사물을 겨냥하여 의미를 창출해 내는 (의미화 작용을 수행하는 것으로서의) 어떤 '지향성'의 존재를 믿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물 및 사물의 상태에 머무는 한 우리는 의식을 가로질러 사물을 있는 그대로 존재하게 놓아두는 어떤 '야생적 체험'의 존재를 믿을 수 있다. 그러나 현상학이 주장하는 "괄호 치기"(mise entre parantheses)[판단 중지]는 단어와 문장으로 하여금 언표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사물과 사물의 상태로 하여금 가시성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했어야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언표는 다른 사물과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도 겨냥하지 않는다. 언표는 주체를 표현하지 않으며 오히려 내재적 변수들로서의 고유하고 만족스러운 주체와 대상을 부여하는 하나의 언어, 하나의 언어-존재로 되돌아갈 뿐이다. 한편 가시성은 이미 어떤 원초적(즉 전-술어적 ante-predicative) 의식을 향해 열려진 어떤 야생의 세계 안에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지향적 시선과도 무관한 엄밀히 내재적인 관점, 비율 및 형식을 자신에게 부여하는 하나의 빛, 하나의 빛-존재로 되돌아갈 뿐이다. 언어와 빛이 적절히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서로를 연결시켜 주는 어떤 방향성들(언어의 의미 형성, 의미 작용, 지시 작용. 물리적 환경, 감각 또는 인지 가능한 세계)이 아니라 상대로부터 분리된 채로 각각을 만족시키는 하나의 환원 불가능한 차원에 의거해 우리가 그것을 검토할 때이다. 빛이 "있다", 그리고 언어작용이 "있다"("il ya" de la lumiere et "il y a" du language). 모든 지향성은 이 두 단자들(monades) 사이의 벌어진 틈, 또는 보기와 말하기 사이의 "비관계" 안에서 붕괴된다. 푸코의 주요한 전환은 현상학에서 인식론으로의 전환이다. 왜냐하면 보기와 말하기는 지식이지만, 우리는 결코 우리가 말하는 것을 보지 않으며 우리가 본 것을 말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의 [담배] 파이프를 볼 때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고 (다양한 방식으로) 말하게 될 것이다. 마치 지향성이 스스로를 부정하고 저절로 붕괴된다는 듯이 말이다. 모든 것은 지식이며, 이것이 바로 야생적 체험 따위가 존재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이다. 지식의 이전 또는 아래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ㅇ낳는다. 그러나 지식은 말하기와 보기, 언어와 빛이라는 환원 불가능한 방식의 이중성을 갖는데, 이는 지향성이 존재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된다.
그러나 모든 것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왜냐하면 현상학은 자신에게 지속적인 부담으로 남아 있던 심리학주의 및 자연주의를 제거하려는 와중에서 이제는 그 자신이 의식과 그 대상(l'etant)사이의 관계로서의 지향성을 지양해 냈기 때문이다. 한편 하이데거 및 이후의 메를로-퐁티에게 있어서, 지향성의 지양은 '존재'(l'Etre)에로, 그리고 '존재'의 주름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 지향성에서 주름으로, 존재자에서 '존재'로, 현상학에서 존재론으로. 하이데거의 후계자들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로 존재론이 주름과 분리 불가능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었다. 그들은 '존재'야말로 정확히 자신이 존재자와 함께 만들어 내는 주름이며 또한 그리스인들의 최초의 시도와 같은 존재의 펼침은 어떤 주름의 대립물이 아닌 주름 그 자체, '밝힘'의 결정적 전환점, 드러냄과 감춤의 단일체임을 알려 주었다. 이런 존재의 접힘, 존재와 존재자의 주름이 어떻게 지향성을 대체하는가 하는 점은 여전히 불분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하나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었다. 근본적, "수직적" 가시성이 어떻게 '스스로 보는 것'(Se-voyant)안으로 접혀 들어가는가, 또 이에 따라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의 수평적 관계가 가능하게 되는가를 보여 준 것은 메를로-퐁티이다. 어떤 외부보다도 멀리 있는 하나의 '바깥'은 어떤 내부보다도 깊은 하나의 '안쪽'으로부터 "스스로 뒤틀리고" "주름 접히며" "이중화"된다. 또한 내재적인 것과 외재적인 것 사이에서 파생되는 관계는 오직 '바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심지어 이 뒤틀림이 고유한 육체 및 그것의 대상을 넘어서는 "살"(Chair)을 정의한다. 간단히 말해 존재자의 지향성은 존재의 주름, 주름으로서의 '존재'를 향해 지양된다(반면 사르트르는 존재의 주름에 도달하지 못하고 존재자의 "구멍"을 만드는 것에 만족했기 때문에 지향성의 개념에 머물러 있게 된다). 지향성은 스스로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유클리드적 공간 안에서 다시 한번 생성된다. 이 유클리드적 공간은 '바깥'과 '안쪽', '가장 먼 것'과 '가장 가까운 것'을 이어 주는 또 하나의 공간 즉 "위상학적" 공간에 의해 지양되어야 한다. *36) '주름', 얽힘(entrelacs) 또는 교착(chiasme), "가시적인 것의 자기에로의 회귀"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메를로퐁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또한 메를로-퐁티는 자신의 "작업 노트"에서 위상학을 구성하는 수직적 차원을 향하는 방식으로 지향성을 지양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메를로-퐁티에 있어 이런 위상학은 회귀의 장소로서의 "살"의 발견을 함축한다. 이것이 우리가 -남겨진 미완성 원고에서 푸코가 보여 주고 있는 바대로의- [살의 고백]에서 보이는 제반 분석이 살의 그리스도교적 기원을 중심으로 한 섹슈얼리티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살펴본 "주름pli"(incarnation)의 문제 전체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근거이다.*
푸코가 주름, 이중체와 같은 자신의 주요한 주제들과 관련되어 하이데거와 메를로-퐁티로부터 강력한 이론적 영감을 받았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한편 푸코가 그런 영감의 실천적 실행의 모델을 발견한 것은 루셀에서이다. 루셀은 언제나 어떤 "스스로 보는 것" 안으로 뒤틀려 들어감으로써 시선 또는 그것의 대상과는 다른 차원에 존재하게 되는 하나의 존재론적 '가시성'을 만들어 냈다. * 37) 푸코의 텍스트 [레몽 루셀]은 이런 점을 잘 보여 주는데 특히 시선이 펜대 안에 박혀 있는 렌즈를 지나는 장면이 그러하다. "존재의 내적인 축제... 시선을 벗어나는 가시성, 만약 우리가 어떤 렌즈 또는 장식물을 통해 그것에 도달한다면 그것은... 시선을 괄호 안에 넣기 위함이다. ... 존재는 스스로에게 과도한 평온함을 부과한다. ..."* 또한 우리는 마찬가지로 [자리Alfred Jarry의] 파타피지크(pataphysique)가 사실상 형이상학에 대한 하나의 지양, 즉 명시적으로 현상의 존재에 기초한 하나의 지양으로 드러난다는 의미에서 하이데거와 자리를 연결시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자리 또는 루셀을 하이데거 철학의 실현으로 간주한다면, 이는 주름이 하나의 전혀 다른 풍경 안으로 옮겨지고 자리 잡는다는 것, 즉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는 말이 아니겠는가? 논점은 하이데거의 진지성을 무시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루셀(또는 자리)의 냉철한 진지성을 재발견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존재론적 진지성은 일종의 악마적 또는 현상학적 유머를 필요로 한다. 사실상 우리는 푸코에게서 보이는 이중체로서의 주름이 그 존재론적 입장을 완전히 견지하면서도 전혀 새로운 하나의 모습을 갖게 될 것으로 믿고 있다. 우선 하이데거 또는 메를로-퐁티에 따르면 존재의 주름은 지향성을 전혀 다른 하나의 차원 안에 정초시킴으로써만 지향성을 지양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가시적인 것' 또는 '밝힘'이 언제나 말하기 및 보기의 대상을 동시에 제공하는 이유이다. 그 이유는 언제나 주름이 시각에 있어서의 '스스로 보는 것'[스스로를 보는 것](se-voyant)과 언어작용에 있어서의 '스스로 말하는 것'[스스로에ㅔ 대해 말하는 것](se-parlant)을 동시에 구성하기 때문이다. 이는 언어작용 안에서 스스로 말하고 시각 안에서 스스로 보는 것은 모두 동일한 하나의 세계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하이데거와 메를로-퐁티에 있어 '빛'이란 하나의 보는 방식뿐 아니라 하나의 말하는 방식을 여는 것이다. 마치 의미작용이 가시적인 것을 포획하고 있다면, 가시적인 것은 의미를 속삭이고 있는 것과도 같다. *38) 하이데거에 있어서의 '밝힘'(Lichtung)은 빛과 가시적인 것은 물론 목소리와 소리를 향한 '열림'(l'Ouvert)이다. 이는 메를로-퐁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푸코는 이런 연관성 전체를 거부한다.* 한편 빛-'존재'는 오직 가시성에로만, 언어작용-'존재'는 오직 언표에로만 되돌아가는 푸코에게 있어 사정이 이와 같을 수는 없다. 지향성은 결코 지향적이지 않은 한 지식의 두 부분들 사이의 이접에서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주름은 결코 지향성을 재정초하지 않는다.
만약 지식이 두 형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 이 형식들 각각이 나름의 대상과 주체를 갖는다면 어떻게 지식에 대상을 향한 주체의 지향성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 39) 예를 들면 어떤 "의식"에 의해 겨냥될 수 있는 광기라는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광기는 시대들, 심지어는 한 시대의 다양한 문턱들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지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언표된다. 우리는 동일한 광인들을 보거나 동일한 병을 언표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형식들 사이의 '비관계'로부터 출현하는 하나의 관계가 확보되어야 한다. 지식은 존재이며 또한 존재의 첫 번째 모습이지만, 존재는 이 두 형식들의 사이에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하이데거가 "둘 사이"(entre-deux)라고, 그리고 메를로-퐁티가 "얽힘 또는 교착"(l'entrelacs ou le chiasme)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것이 아닐까? 그러나 이들은 사실상 전혀 같은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메를로-퐁티에게 있어 얽힘과 '둘 사이'는 주름과 뒤섞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푸코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다. 가시적인 것과 언표 가능한 것의 상호 얽힘(entrelacement), 상호 교차(entrecroisement)가 존재한다. 이는 옷감 짜기(tissage)의 플라톤적 모델로서 지향성을 대체한다. 그러나 이 상호 얽힘은 지식-'존재'(l'Etre-savoir)의 두 형식들이라는 환원 불가능한 두 적수들 사이의 구속이자 전투이다. 그것은 -우리가 원한다면- 하나의 지향성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가역적이고 양 방향 모두에서 다수화되어 있으며 극소화, 미소화된 지향성이다. 이는 존재의 주름이 아닌 두 형식들 사이의 얽힘이다. 이는 주름의 위상학이 아닌 얽힘의 전략이다. 모든 것은 마치 푸코가 하이데거와 메를로-퐁티가 지나치게 멀리 가 버렸다고 비난하기라도 하는 양 전개된다. 그리고 푸코가 루셀에게서, 그리고 도 다른 방식으로 브리세에게서,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 마그리트에게서 발견한 것, 그리고 아마도 그가 자리에게서 발견할 수도 있었던 것은 언표 가능한 것을 정복하는 사물의 분노, 가시적인 것을 정복하는 말들의 소음, 이중의 포획, 청각적이고도 시각적인 전투이다. * 40) 푸코가 전투의 가장 중요한 발전을 찾아낸 것은 브리세에 의해서이다. "그는 단어를 낳게 하는 소음에 대해 단어를 회복시켰으며 단어가 그것에서 이후 침묵의 문장처럼 형성될 폭력, 습격, 몸짓들을 다시금 되살렸다.* 푸코에게는 모든 존재론을 변형시키는 이중성, 이중체라는 환각적 주제가 항상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만약 투쟁들의 얽힘이 그 자체 비형식적인 요소 즉 형식들의 환원 불가능한 분리에서 생겨나는 하나의 순수한 힘관계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식-'존재'를 구성하는 이 포획적 이중체는 환원 불가능한 '둘 사이'의 제반 형식을 결코 생산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전투의 원천 또는 그 가능성의 조건이다. 이것이 바로 지식의 지층적 영역과는 차별성을 갖는 권력의 전략적 영역이다. 인식론에서 전략으로. 한편 "야생적" 체험이 존재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모든 전투가 하나의 전략을 함축하고 있으며, 모든 체험 또한 권력관계 안에 포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존재의 두 번째 모습이자 지식-'존재'와는 차별성을 갖는 권력-'존재'(Etre-pouvoir), "권력존재"(Possest)이다. 이는 형성된 지식의 두 형식들 "사이의" 제반 관계를 복원시키는 비형식적 권력관계들 또는 힘관계들이다. 언표들이 이들 중 하나의 형식 안에서 분산되는 반면 가시성들은 나머지 하나의 형식 안에서 분산되기 때문에 지식-'존재'의 두 형식들은 외재성의 형식들이 된다. 그러나 권력-'존재'는 우리에게 형식화 불가능하며 또 형성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바깥'이라는 또 다른 요소를 제공한다. 힘들 및 그것의 변형 가능한 조합들인 이 '바깥'으로부터 생겨난다. 이처럼 존재의 두 번째 모습 또한 여전히 주름이 아니다. 전투 안에서 두 형식들 사이의 유일한 소통을 가능케 하는 것은 차라리 윤곽 없이 유동하는 하나의 선이다. 결국 현상학은 너무나도 화해적이며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축복해 주었기 때문에 푸코에게는 언제나 하이데거의 그것보다 더욱 심오한 하나의 헤라클레이토스주의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제 푸코는 바깥으로부터 오는 요소 즉 힘을 발견한다. 블랑쇼처럼 푸코 역시 '밝힘'보다는 '바깥'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힘은 다름 아닌 바깥의 힘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형식들의 외재성을 "설명하는" 것 또한 바깥이다. 그리고 이는 이 형식들 각각에 대해서든 또는 그것들 사이의 상호 관계에 있어서든 마찬가지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푸코가 행했던 다음과 같은 선언의 중요성이 기인한다. 나는 언제나 하이데거에게 매혹당했지만 니체를 통해서 또는 니체를 따라서가 아니라면 결코 그를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그리고 그 역은 성립되지 않는다). * 41) "나의 모든 철학적 장래는 하이데거의 독해에 의해 결정되었다. 그러나 나를 그에게 인도해 주었던 인물이 니체였음을 나는 인정한다. ..."* 하이데거는 니체의 가능성이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니체는 자신의 고유한 가능성이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우리가 이 바깥을 극한 즉 그것으로부터 존재가 구부러지는 궁극적 지평으로서 발견하고자 원했다면, 우리는 니체적 의미의 힘, "힘에의 의지"라는 특별한 의미에서의 권력을 다시금 발견했어야 했다. 하이데거는 너무도 서둘렀고 너무도 성급히 모든 것을 정리해 버렸으며, 이는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었다. 하이데거의 기술적(technique), 지식의 기술 및 권력의 정치학이 보여 주는 뿌리 깊은 모호함은 바로 여기서 기인한다. 존재의 주름은 오직 그 세 번째 국면의 수준에서만 생성 가능하다. 마치 바깥이 자신과 같은 외연을 갖는 어떤 안쪽을 스스로의 힘만으로 구성해 내는 것처럼, 힘 또한 자기가 자기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또 자기로부터 영향을 받는 바로 그런 방식으로 스스로를 드러낼 수 있을까? 그리스인들이 행했던 것은 어떤 기적이 아니다. 하이데거에게는 일종의 르낭적 견해 즉 그리스적 계몽주의 또는 그리스의 기적이라는 관념이 존재한다. *42) 르낭에게서 흥미로운 것은 [풍자시][아크로폴리스 위에서의 기도]가 "그리스의 기적"을 본질적으로 기억에 관련된 것으로서, 또한 기억을 ('게으름 피우기'라는)권태의 시간 구조 안에서 역시 근본적으로는 망각에 관련된 것으로서 소개하는 그의 방식이다. 제우스 자신은 "자기 자신 위로 되접히고 깊은 숨을 쉰 후에" '지혜'를 낳는 겹주름으로서 규정된다.* 푸코는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인들은 바라보기에 따라 항상 지나치거나 또는 모자란다. 그들은 힘을 복종시켰으며 오직 전략에 의해서만 복종될 수 있는 어떤 것으로서의 힘을 발견했다. 이는 그들이 자유인들 사이의 경쟁을 관통하는 하나의 힘관계를 발명해 냈기 때문이다(만약 그가 자신을 지배할 수 있다면 그는 다른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다). 그러나 힘들 중의 힘인 인간이 자신을 구성하는 힘을 복종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바깥이 그 자체로 복종하는 동시에 인간 안에서 어떤 '자기'(Soi)를 파고 들어갈 때뿐이다. 존재의 주름이 출현하는 것은 이미 형식들이 얽혀 있으며 전투들이 시작되 바로 이 세 번째 국면이다. 따라서 바깥의 주름이 하나의 '자기'를 구성하는 반면 바깥 그자체는 동일한 외연을 갖는 하나의 안쪽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존재는 이제 -더 이상 "지식 존재"(Sciest) 또는 "권력 존재"(Possest)가 아닌- "자기 존재"(Se-est)의 형식을 갖게 된다. 존재론적 주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지층적, 전략적 얽힘을 횡단해야만 했던 것이다.
이들은 지식, 권력, 자기라는 환원 불가능하지만 언제나 동시에 다른 것들을 함축하는 세 개의 차원들이다. 이것들은 세 개의 "존재론들"이다. 왜 푸코는 이 존재론들이 역사적이라고 덧붙엿던 것일까? 왜냐하면 이것들은 결코 어떤 보편적 조건들을 지정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지식-존재는 어던 순간에 있어서의 가시적인 것과 언표 가능한 것이 취하게 되는 두 형식에 의해 결정되며, 빛과 언어 또한 그것들 자신이 어떤 지층 위에서 취하게 되는 "특이하고 제한된 실존"과 분리 불가능하다. 권력-존재 또한 그 자신 가각 시대의 다양한 특이성들을 관통하는 힘관계 안에서 결정된다. 한편 자기, 자기-존재(l'etre-soi)는 주체화의 과정 즉 주름이 관통하는 여러 장소들에 의해 결정된다(그리스인들은 결코 어떤 보편적 모델이 아니다). 간단히 말해 조건들은 결코 자신에 의해 조건화되는 것들 이상으로 일반적이지 않으며 오직 자신의 고유한 역사적 특이성이라는 가치만을 가질 뿐이다. 또한 조건들은 결코 "논리적으로 필연적인[필증적인]"(apodictique)것들이 아니며 오직 '문제적인'(problematique) 것들일 뿐이다. 조건들이란 역사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역사와 함께 변화하는 것이다. 이 조건들이 보여 주는 것은 사실상 어떤 하나의 역사적 형성작용 안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방식이다. 어떤 빛과 언어작용의 조건 아래 나는 무엇을 알 수 있으며 무엇을 보고 또 언표할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나는 어떤 권력을 요구할 수 있고 또 어떤 저항으로 맞설 수 있는가? 나는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나는 어떤 주름에 둘러싸여 어떤 방식으로 나 자신을 주체로서 생산할 수 있는가? 이런 세 질문들 아래에서 "나"(le je)는 더 이상 어떤 보편적 존재가 아니며 다만 '사람들이 말하고-보며, 서로 맞부딪치고 또 살아가는 것'(un On parle-On voit, On se heurte, On vit)에 몰두해 있는 모든 특정 위치들의 총체이다. * 44) 또한 다음에서 푸코는 칸트를 보편적 주체에 대한 질문뿐 아니라 "역사의 이 정확한 순간[현재]에 있어서의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한 인물로서 상찬하고 있다.* 시대와 시대를 가로질러 적용될 수 있는 해결책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새로운 영역에 있어 어떤 이전 문제의 소여를 다시 한번 활성화시키는 문제 영역들의 침투 또는 침식은 존재할 수 있다(아마도 푸코에게는 어떤 그리스인, 말하자면 쾌락의 "문제화"에 대한 일종의 신뢰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결국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유일한 연속성, 또는 반대로, 현재가 과거를 설명하는 방식을 구성하는 것은 실천이다. 만약 푸코의 대담들이 그의 저작들 중 완전한 한 부분을 구성한다면, 그것은 이 대담들이 관기, 처벌 또는 섹슈얼리티와 같은 현재적 문제의 구성을 향한 푸코 저작들 가각의 역사적 문제화(problematisation)를 연장한 것이기 때문이다. 중심화되어 있거나 또는 매개되어 있기보다는, 차라리 횡단적이며 직접적인 투쟁의 이 새로운 유형은 어떤 것들인가? 보편적이기보다는, 차라리 특수한 또는 "특이한" "지식인"의 이 새로운 기능은 어떤 것들인가? 자기 동일적이기보다는, 차라리 자기 정체성이 부재하는 주체화의 이 새로운 양식은 어떤 것들인가? 이는 다음 질문의 삼중적인 현실적 근원이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아는가? 나는 누구인가?(Que puis-je? Que sais-je? Que suis-je?) 1968년으로 이끈 사건들은 마치 이 세 질문들의 "되풀이"와도 같았다. *45) 몇 몇 분석들을 읽다 보면 우리는 마치 1968년이 파리 지식인들의 머릿속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믿게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이 이미 새로운 주체성의 생산을 향한 투쟁을 위한 새로운 형식들의 출현에 연결되어 있었던 일련의 국제적인 사상적 흐름의 연속 및 세계적 사건들의 오랜 추이에 의해 생겨난 결과물이었음을 기억해만 한다. 이는 그것의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 및 "삶의 질"에 연관되었던 질적인 요구만 보더라도 분명히 드러난다. 세계적 사건의 측면에서, 우리는 자주화 운동에 관련되었던 유고슬라비아의 경험, 체코슬로바키아의 봄 및 이후의 억압, 베트남 전쟁, 알제리 전쟁 및 네트워크의 문제뿐 아니라 "새로운 계급"(새로운 노동 계급)의 징후들, 농민들 또는 학생들의 새로운 조합주의, 이른바 제도적 교육 또는 정신의학 센터들... 등에 대해 간략히 언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상적 측면에서는,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는 이미 새로운 주체성의 문제를 제기했던 루카치의 [역사와 계급 의식]에로 거슬러 올라가야만 할 것이다. 한편 프랑크푸르트 학파, 이탈리아 마르크스주의 및 초기 "자율화 운동"의 싹들(마리오 트론티), 사르트르의 주변에서 벌어진 새로운 노동 계급에 대한 고찰(앙드레 고르) 도한 "사회주의냐 야만이냐"(Socialisme ou barbarie), "상황주의"(Situationisme), "공산주의의 길"(Voie communiste)(특히 펠릭스 가타리와 "욕장의 미시정치학"micro-politique du desir) 등과 같은 그룹들도 언급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런 사조들 및 사건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68년 이후 푸코는 개인적으로 '감옥에 관한 정보 그룹'(Le Groupe d'information sur les Prisons, GIP, 1971) 및 감옥 투쟁과 함께 투쟁의 새로운 형식들이라는 문제를 재발견하고, 이는 이후 [감시와 처벌, 감옥의 탄생]을 계기로 '권력의 미시물리학'으로 세련화된다. 이후 푸코는 새로운 주체성의 문제에 도달하는데 푸코는 이 경우에는 아마도 미국의 제반 운동들과의 연관 하에서 그 기초적 자료들을 [지식의 의지]에서 [쾌락의 활용]에 이르는 시기 동안 변형시키게 된다. 투쟁, 지식인, 주체성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에 실린 푸코의 분석을 참조하라. [미셸 푸코], 301-303. 한편 새로운 공동체 형식을 향한 푸코의 관심은 분명 본질적인 것이었다.* 우리의 빛, 우리의 언어작용, 즉 오늘날 우리의 "진실"은 무엇인가? 이전의 투쟁들이 더 이상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오늘날 우리는 어떤 권력들에 맞서야만 하며 또 우리의 저항 능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아마도 우리는 이미 "어떤 새로운 주체성의 생산"을 목격하고 또 그것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자본주의의 변이들은 저항의 초점으로서의 어떤 새로운 '자기'의 완만한 출현 안에서 예상치 못했던 하나의 "맞대면"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각각의 사회적 변이들은 매번 -비록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의 주체적인 재배치(reconversion) 운동 및 그 잠재성들을 또한 발생시키는 것이 아닐까? 이런 질문들은 순수한 권리의 문제를 포함하는 인간의 보편적 구너리에 대한 질문 이상의 중요성을 갖는 것으로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푸코에게 있어 모든 것은 지식의 변수들(예를 들면 언표의 내재적 변수들로서의 주체와 대상) 및 형식 관계들의 변화, 권력의 가변적 특이성들 및 힘관계의 변화, 가변적 주체성들 및 주름 또는 주체화의 변화 등과 같은 변수와 변화 안에 놓여 있다.
그러나 설령 '조건들은 결코 조건 지어지는 것들보다 더 일반적 또는 불변적이지 않다'라는 주장이 사실이라 해도 여전히 푸코의 관심을 끄는 것은 조건들이다. 이것이 바로 푸코가 [중요한 것은] 역사가의 작업이 아닌 역사적 연구라고 말한 이유이다. 푸코가 수행한 것은 어떤 심성이 아닌, 언표들 및 언어의 체계 즉 그 아래에서 정신적 존재를 갖는 모든 것들이 스스로 드러나는 제반 조건들의 역사이다. 그가 수행한 것은 어떤 행동이 아닌, 빛의 체계 즉 그 아래에서 가시적 존재를 갖는 모든 것들이 자신을 드러내게 되는 조건들의 역사이다. 그가 수행한 것은 어떤 제도가 아닌, 그 아래에서 제도에 의해 주어진 사회적 장이라는 지평 위에서 다양한 힘의 미분적 관계들이 적분되는 제반 조건들의 역사이다. 그가 수행한 것은 어떤 사적 생활이 아닌, 그 아래에서 자기와의 관계가 하나의 사적 생활을 구성하는 제반 조건들의 역사이다. 그가 수행한 것은 어떤 주체가 아닌, 사회적, 존재론적 영역 안에서 작동되는 주름작용들 아래에 존재하는 주체화 과정들의 역사이다. 진실로 푸코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사유 즉 하이데거에 의해 제기되었고 푸코에 의해 다시 물어졌으며 무엇보다도 하나의 화살이었던 다음과 같은 하나의 질문이다. "사우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사유라 부르는가?"(que signifie penser? qu'appelle-t-on penser?) 하나의 역사,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유 자체의 역사. 사유란 체험하는 것이며 문제화하는 것이다. 지식, 권력 및 자기는 이런 사유의 문제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삼중적 근원이다. 우선 문제로서의 지식에 따르면, 사유란 보기이자 말하기이지만, 사유가 생성되는 것은 '둘-사이', 이 둘의 틈새 또는 이접 안에서이다. 그것은 매번 얽힘을 창조하는 것이며 매번 어느 한쪽으로부터 다른 쪽의 과녁을 향해 화살을 소는 것이며 단어들 안에서 빛의 섬광을 번쩍이게 하는 것이자 가시적인 사물들 안에서 외침이 들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유란 보기와 말하기로 하여금 각자 자신의 극한에 도달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양자는 서로를 분리시키는 동시에 이어 주는 공통적 극한이 된다.
한편 문제로서의 권력의 기능에 따른다면, 사유란 특이성들을 방사하는 것, 주사위를 던지는 것이다. 주사위 던지기란 사유가 언제나 바깥에서 오기 때문이다(이 바깥은 이미 틈새 안으로 휩쓸려 들어간 또는 공통 극한을 구성한 바깥이다). 사유는 본유적인 것도 획득되는 것도 아니다. 사유는 어떤 능력의 본유적 실행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적 세계에서 구성되는 어떤 학습도 아니다. 이 본유적인 것과 획득된 것을 아르토는 "생식기"(le genital), 사유의 생식 능력(genitalite) 자체에 대립시킨다. 물론 이때의 사유는 어떤 외적 세계보다도 멀리 있으며 동시에 어떤 내적 세계보다도 가까이 있는 하나의 바깥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우리는 이 바깥을 '우연'이라고 불러야 할까? 사실상 주사위 던지기란 가장 단순한 권력 또는 힘들의 관계 즉 우연히 뽑혀진 특이성들 사이에 성립되는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다. 푸코가 이해하는 바의 힘관계란 인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힘관계는 우연적인 추출 또는 차라리 그 인력, 어떤 특정한 언어에 따르는 집합에서 보이는 [출현] 빈도에 있어서의 알파벳 글자들, 요소들에도 역시 관련된다. 우연은 오직 맨 처음 주사위를 던질 때에만 의미를 갖는다. 아마도 두 번째의 던지기는 마치 부분적인 재-연쇄화의 연속 즉 마르코프의 사슬처럼 첫 번째 던지기에 의해 부분적으로 결정된 제반 조건 하에서 작동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바깥이다. 바깥은 이렇게 우연적인 뽑기를 임의성과 의존성의 혼합 안으로 재-연쇄화시키는 선이다. 따라서 사유는 이제 새로운 모습을 갖게 된다. 특이성들의 도출, 도출의 재-연쇄화, 매번 하나의 특이성의 근방으로부터 다른 특이성의 그것으로 이동하는 일련의 계열들의 창조. 언제나 바깥으로부터 오는 일련의 특이성들: 힘관계 안에 포착된 권력의 특이성들, 변이를 준비하는 저항의 특이성들, 심지어는 관계 안으로 들어오지도 적분되지도 않으면서 언제나 바깥에 남아 있는 야생적 특이성들(이것이 "야생적인 것"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경우인데 이는 물론 어떤 하나의 체험이라는 의미가 아니며 다만 아직 체험의 영역 안에 들어오지 않은 어떤 것이라는 의미이다.) *48) 푸코는 이곳에서 "야생적 외재성"(exteriorite sauvage)을 언급하면서, 자기 동시대의 생물학과 동일시할 수 없는 제반 방법론, 개념 및 생물학적 대상을 구성해 냈던 멘델의 예를 인용한다. 이는 야생적 관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관념과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 모든 체험은 이미 지식관계 또는 권력관계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야생적 체험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정확히 말하자면 야생적 특이성들은 권력과 지식으로부터 밀려나 "주변부"(marges)로 보내지고 따라서 과학은 야생적 특이성들을 인식할 수 없다.*
사유의 이 모든 결정 과정은 이미 사유 행위의 기원적 형상이다. 그리고 오랫동안 푸코는 사유가 그 이외의 어떤 것이 될 수 있으리라고는 믿지 않았다. 사유는 자신이 그로부터 유래했으며 "사유되지 않은 것[비-사유]"(l'impense)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이 바깥이 아니라면 자신 안에서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바깥이 아니라면 사유가 어떻게 하나의 도덕을 창조해 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정언 명법도 무효로 만드는 이 결단(Fiat)! *49) 후설 자신은 사유에 있어서의 "결단"을 주사위 던지기 또는 점의 위치 선정과 같은 것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푸코는 도 하나의 기묘하고도 최종적인 모습의 출현을 위해 속도를 가한다. 만약 어떤 외재적 세계보다도 먼 이 바깥이 동시에 어떤 내적 세계보다도 가까운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유가 바깥을 자신에 고유한 '비-사유'로 간주함으로써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징후가 아닌가? "그것[사유]은 사고되지 않은 것을 자신에게 더욱더 가까이 함으로써만 또는 아마도 그것을 멀리 밀어 버림으로써만 도는 어떤 경우이든 바로 그런 사실에 의해 변형된 -왜냐하면 인간 존재는 바로 이 거리 안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인간 존재를 생성시킴으로써만... 사고되지 않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자기에 대한 이 영향력, 먼 것과 가가운 것의 이런 전환은 이후 주름선 위에서 항상 바깥의 공간과 동시에 존재하는 안쪽 공간(espace du dedans)의 구성에 점점 더 큰 중요성을 갖게 될 것이다. 이제 문제화된 '사유되지 않은 것'은 윤리적 주체로서 자기 자신을 문제화하는 하나의 생각하는 존재에게 자리를 내준다(이는 아르토에게 있어 "본유적 생식"genital inne이며, 푸코에게는 자기와 섹슈얼리티의 만남이다). 사유란 주름을 접는 행위이며, 서로 동일한 외연을 갖는 어떤 특정한 안쪽의 바깥을 이중화하는 행위이다. 이미 특이성들의 "근방에서"(au voisinage) 시작되었던 사유의 일반 위상학은 이제 바깥에서 안쪽에 이르는 주름작용 안에서 완성된다. "외부의 내부에서, 그리고 그 반대로"(a l'interieur de l' exterieur et inversement), 이것이 [광기의 역사]가 말한 바였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증명할 수 있었다. 모든 조직화(미분 및 적분)는 매개적, 상대적인 외재성 및 내재성을 이끌어내는 절대적 안쪽과 바깥의 일차적인 위상학적 구조를 전제한다. 모든 안쪽의 공간은 거리와는 무관하게 그리고 어떤 한 '생명체'의 한계 위에서 바깥의 공간과 위상학적으로 접촉되어 있다. 또한 공간에 의해서는 결코 설명될 수 없는 이 살의 또는 생기의(charnelle ou vitale) 위상학은 하나의 시간을 해방시킨다. 한편 이 시간은 과거를 안쪽에 응축시키고 미래를 바깥에 생겨나게 하며 살아 있는 현재의 극한에서 과거와 미래를 충돌시킨다. 푸코는 더 이상 단순히 고골과 같은 문서고학자 도는 체호프와 같은 지도제작자가 아니다. 그는 위대한 소설 [페테르부르크]에서 외피적 주름으로부터 바깥과 안족의 전환을 이끌어 낸 벨리(Andrei Bely)와 같은 위상학자이다. 이차적 공간 내에서의 서로에 대한 이면에 불과한 도시와 두뇌의 적용. 푸코가 이중화 또는 주름을 이해하는 것은 하이데거와는 전혀 무관한 바로 이런 방법론에 의해서이다. 만약 안쪽이 바깥의 주름작용에 의해 구성된다면 이 둘 사이에는 하나의 위상학적 관계가 존재하게 된다. 자기와의 관계는 바깥에 대한 관계와 대응한다. 이 두 관계들은 상대적으로 외재적인(따라서 상대적으로 내재적인) 환경인 지층이라는 매개를 통해 접촉한다. 지층의 극한에서 안족 전체는 능동적으로 바깥에 나타난다. 안쪽은 연속적인 것은 전혀 아니지만 바깥으로부터 오는 미래와 과거를 대면시키고 교환하며 다시 창조하는 일련의 양식들 위에서 과거를 응축한다(장기 지속). 사유란 극한적으로 현재에 종속된 지층에 스스로를 부리내리는 것이다. 오늘 나는 무엇을 볼 수 있으며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그러나 그것은 또한 자기와의 관계 위에서 안쪽에 응축되어 있는 과거를 사유하는 것이다(내 안에는 한 명의 그리스인 또는 그리스도교인이 있다...). 현재에 대립하여 과거를 사유한다는 것, 현재에 저항한다는 것은 결코 어떤 회귀를 위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다가올 시간을 -나는 바라기를- 위하여"(니체) 즉 다시 말해서 과거를 바깥에 대해 능동적이고 현재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리하여 드디어는 어떤 새로운 무엇인가가 도래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유가 언제나 새로운 사유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사유는 자신의 고유한 역사(과거)를 사유하지만 그것은 오직 자신이 사유하고 있는 것(현재)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그리하여 결국에는 "다르게 사유하기"penser autrement(미래) 위한 것이다. 이것이 블랑쇼가 "바깥의 정열"(passion du dehors), 오직 바깥 자신이 "친화성"(intimite), "침입"(intrusion)이 되기 때문에 바깥을 향하려 하는 하나의 힘이라 불렀던 것이다. 한편 위상학의 세 가지 심급들은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동시에 항상적인 상호 교환의 상태에 있다. 지층은 새로운 무엇인가를 보고 말하게 만드는 층(couches)들을 끊임없이 생산한다. 그러나 한편 바깥과의 관계는 기존의 힘들을 끊임없이 다시금 문제화하며 결국에는 자기와의 관계가 주체화의 새로운 양식들을 불러내고 생산하도록 만든다. 푸코의 작업은 우리로 하여금 사유의 의미를 변화시켰던 그런 위대한 작업들을 끊임없이 되-묶이도록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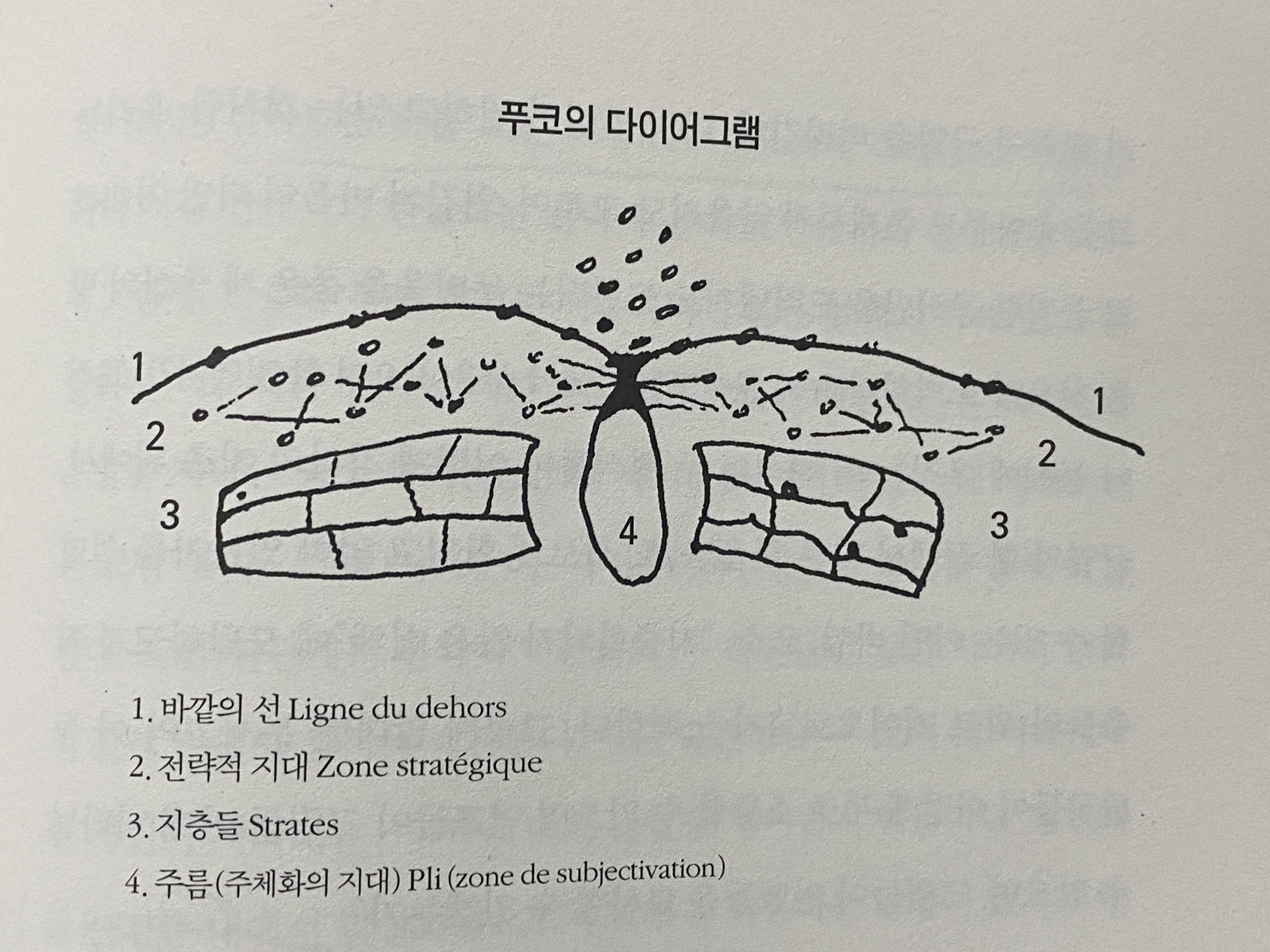
"나는 허구들 이외의 다른 것을 쓰지 않았다. ..." 그러나 어떤 허구도 이렇게 많은 진실과 현실을 생산한 적은 없었다. 우리는 푸코의 거대한 허구들에 대해 무어라 말할 수 있을까? 세계는 중첩된 표면들, 문서고들 도는 지층들로 만들어져 있다. 또한 세계는 지식이다. 그러나 지층들은 한편으로는 시각적 그림들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청각적 곡선들을 분리시키는 하나의 중심저 균열에 의해 횡단된다. 각 지층마다 존재하는 언표 가능한 것 및 가시적인 것, 즉 지식의 두 가지 환원 불가능한 형식들, '빛'과 '언어작용', 가시성과 언표 가능성이 각각 위치하는 외재성의 이 거대한 두 가지 환경들, 따라서 우리는 하나의 이중적 운동 안에 포착되어 있다. 우리는 하나의 지층에서 또 다른 지층으로, 하나의 띠(bandelette)에서 도 하나의 띠로 빠져 들어간다. 우리는 표면들, 그림들, 곡선들을 횡단한다. 우리는 세계의 어떤 안쪽에 도달하기 위하여 균열을 따라간다. 마치 멜빌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곳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르며, 인간의 마음이 다만 거대하고 끔찍한 공허만을 드러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품은 채 중심의 방을 찾으려 노력한다(누가 문서고들 안에서 삶을 찾으려 할 것인가?).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지식의 두 형식들이 어떻게 각각의 지층 위에서, 균열의 한 끝에서 다른 한 끝으로, 서로 융합되고 얽혀 있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바깥, 요소, "지층화되지 않은 실체"에 도달하고자 지층들의 위로 기어오르고자 노력한다. 그렇지 않다면 문서고의 이 두 반쪽들이 어떻게 서로 소통할 수 있으며 언표들이 그림들 아래 나타날 수 있으며, 그림들이 언표들을 묘사할 수 있겠는가?
이 형식화되지 않은 바깥은 하나의 전투이다. 그것은 특이점들 및 그들 사이의 힘관계들이 작용하는 소용돌이와 태풍의 지대이다. 지층은 다만 그 위에서 펼쳐지는 이 전투의 시각적 먼지와 음향적 반향을 모아 견고화시킬 분이다. 그러나 그 위의 특이성들은 형식을 갖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가시적인 신체들 또는 말하는 개인들인 것도 아니다. 우리는 출현과 소멸(비샤의 영역), 불확실한 이중성과 부분적 죽음의 영역 안으로 진입한다. 그것은 미시물리학의 영역이다. 포크너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그 위에서 개인들로서가 아니라, 서로 상대를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두 마리의 나방 또는 두 개의 깃털처럼 행동한다. "맹렬히 그리고 천천히 퍼지는 먼지 구름의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이렇게 외치며 몸을 던진다, 더러운 놈들에게 죽음을! 죽여라! 죽여!" 이 지대의 대기 상태 각각은 그 관계들 안에 포착된 하나의 특이성들 또는 힘들의 다이어그램(전략)에 대응된다. 만약 지층들이 땅에 속하는 것이라면, 전략들은 하늘 도는 대양(oceanique)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층 안에서의 현실화는 전략에, 문서고 안에서의 현실화는 다이어그램에, 지층화 작용 자체는 지층화되지 않은 실체에 속해 있다. 현실화는 적분하는 동시에 미분한다. 비형식화된 힘관계들은 특이성의 근방을 지나는 곡선 형식(언표) 및 특이성을 빛의 형상 안에 재배치하는 ㄴ그림 형식(가시성)이라는 두 가지 이질적 형식의 창조를 통해 미분된다. 또한 힘관계는 정확히 미분화의 두 측면들인 양자 사이의 형식적 관계 안에서 동시에 적분된다. 이는 힘관계가 -오직 그 아래에서만 자신이 시작되는- 지층 내의 균열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힘관계들은 지층 내에서 현실화됨으로써 균열을 확장하는 경향이 있지만 마찬가지로 끊임없는 적분과 미분을 통해 양 방향에서 그것의 위쪽을 향해 치솟는 경향이 있다.
힘들은 언제나 '바깥', 즉 어떤 외재성의 형식보다도 더 먼 하나의 특정한 바깥에서 온다. 마찬가지로 힘관계 안에 포착된 특이성들 뿐만 아니라, 언제나 이 관계를 변형시키고 그것들을 전복시키며 또 불안정한 다이어그램들을 변화시키려 하는 저항의 특이성들이 존재한다. 또한 심지어는 바깥의 선 자체 위에 존재하면서 아직 [어떤 것과도] 연결되지 않은 채 특히 균열의 바로 위에서 부글거리며 끓고 잇는 야생적 특이성들마저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이 태풍 자체 위에서 모든 다이어그램들을 휘젓는 그 무시무시한 선, 또는 양끝이 열려 있는 '멜빌의 선'(ligne de Melville)이다. 이 선은 어떤 배이든 자신의 어지러운 파도 안으로 밀어넣어 버리는 선이며 자신이 자신이 무시무시한 뒤틀림으로 포효하는 순간 주변의 모든 인간을 삼켜 버리는 그런 선이다. 또는 그것은 분자적 속도로 증가하며 "천 개의 변이를 갖는" '미쇼의 선'(ligne de Michaux), "격렬히 마차를 모는 사람의 채찍질"이다. 그러나 이 선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것이라 해도 그것은 더 이상 힘관계에 따라 측정될 수 없으며 인간을 공포의 너머로 데려다주는 삶의 선이다. 왜냐하면 균열의 장소 위에 "생명이 살 수 있는 또는 심지어 무엇보다도 '삼' 자체인 태풍의 눈", 하나의 고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이 선이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짧은 기간만 존재하는 가속화된 속력이 보다 긴 기간을 통해 "어떤 느린 존재"(un etre lent)를 구성하는 것과도 같다. 그것은 마치 끊임없이 방향을 바꾸고 안족의 공간을 추적함으로써 스스로를 재구성하면서도 언제나 바깥의 선과 동일한 외연을 갖는 하나의 송과선(glande pineale)과도 같은 것이다. 가장 먼 것은 가장 가까운 것으로 전환됨으로써 내부가 된다. 주름들 안의 삶(la vie dans les plis). 이것이 우리가 그 안에 자기를 들여 놓음으로써 더이상 그것이 비어 있으리라고 두려워하지 않는 중심의 방이다. 여기, 이 주체화의 지대 안에서 우리는 자기 속도의 주인, 상대적으로 자신의 분자들 및 특이성들의 주인이 된다. 이것은 외부의 내부로서의 작은 배(l'embarcation comme interieur de l'exterieur)이다.